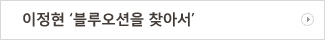- 별이 밤새 곡선을 그리며 자전한다. 사진=조선DB
새벽에 잠이 깨어 시집을 읽다가 자세를 고치고 읽는다.
어떤 시는 오싹한 한기를 느끼게 하고 날카로운 두뇌회전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럴수록 재독(再讀)하며 다시 읽게 한다.
예민한 눈이나 민감한 귀를 불침번으로 사용하는 시인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런 시를 읽으면, 삶이 막대자나 계량기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든다. 문학이 위대한 게 그런 이유다.
자기중심적이며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타협해야 한다고 믿는 고집쟁이들이 많지만, 그래도 삶은, 문학은 그런 고집쟁이가 흘리는 땀, 혹은 탄식을 거치며 점점 깊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김예태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점점 더 ‘휘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의 시에는 무리한 비유나 시적이라고 불리는 장식적 비품이 전혀 없다. 이처럼 삶은, 문학은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그냥 보여만 줘도 된다. 문학이 수많은 비극을 다루는 이유가 그렇다. 비극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 독자는 자기 삶의 옷깃을 고쳐 잡는다.
시집의 서시(序詩)인 <쇠뜨기를 천망(天網)이라 부르는 이유>를 몇 번이고 읽었다. 이 시를 폭넓게 느끼기 위해선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이 문장을 알아야 한다.
‘천망회회 소이부실(天網恢恢 疏而不失)’은 하늘의 그물은 크고 엉성한 것 같지만 결코 놓치는 적이 없다는 말이다. 자연의 법칙은 엉성한 것 같으나 세상의 어느 것 하나에도 미치지 않는 법이 없다는 뜻과 통한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의 자비하심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하늘은
세모필(細毛筆)로 써달라는 쇠뜨기 여린 획에
총총한 은방울을 달아주셨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 이슬 신으셨네’
노래가 마음에 든 쇠뜨기는
은방울을 무지개 방울로 바꿔 달라고 또 떼를 쓰네
비상(非常)이네
무지개방울은 태양의 정수(精髓)
시간과 습도와 각도가 만나는 빛의 정점에서
영롱하게 떠오르는 하늘의 격문인 것을
은총 중인 이들에게(만) 포상하는 하늘의 영광인 것을
하늘땅이 무지갯빛 황홀경으로 차올라
말이 자취를 감출 때
‘악인은 악으로 잡는 것이 아니니라’
쇠뜨기가 받들어 올리는 하늘의 경구(警句)인 것을.…
- 시 <쇠뜨기를 천망(天網)이라 부르는 이유> 전문
작고 여린 여러해살이 풀인 ‘쇠뜨기’조차 신이 사랑하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늘땅이 무지갯빛 황홀경’으로 가득차지 않는 적이 없다. 사막의 은수자(隱修者)들이 모래 바람 가득한 수도원에서 영성적 삶을 사는 이유와도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신이 정의와 불의를 심판하시리라 믿음 너머에는 쇠뜨기 같은 여린 생명에 담긴 자연의 신비, ‘무지갯빛 황홀경’, 신의 자비하심이 담겨 있다. 시인이 따옴표 안에 ‘악인은 악으로 잡는 것이 아니니라’를 넣은 이유를 알 듯도 모를 듯도 같다.
시 <돌의 여정>은 아름다운 시다. 몽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삶의 다양한 변주를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인생을 폭넓게 이해하는 방식을 몽돌의 비유로 말한다. 몽돌… 마멸되고, 마멸되어야만 하는 몽돌. 그렇게 모나지 않아 보이는 둥근 돌이 몽돌이다.
몽돌 이전
폭설과 함께 동장군이 왔다
수도관이 터지고 가스가 끊겼다
연탄 한 장을 위해 시린 무릎으로 산동네를 더듬다가
바람마저 얼어붙은 거리, 옹송그린 뼈마디가 펴지지 않아
119로 실려 간 응급실을 쫓기듯 나와서는
하느님의 문은 불평함으로 열리고 감사함으로 닫히노라
나직한 기도문에 살얼음이 언다
의원을 꾸어주든 얻어오든 그거야 나라님들 흥정이지
금리가 내리든 불법 대출을 하든 변변한 막도장 하나 없는 데야
피 한 방울새지 않는 동맥(冬脈)이라 아직 목숨을 부지했는가
추위는 밖에서 오지 않고 뼛속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몽돌의 노래
합장의 예를 거둬 주시오
나 아직 돌아가는 중이라오
거친 항해에 깎이며 모[角]를 잃었을 뿐
아직 지우지 못한 유골로 남아
육신의 원죄를 지고 가니
내게 찬미의 예를 건네지 마오
파도 거세거든 서로 축복하고
볕이 따갑거든 함께 노래를 부릅시다
몽돌 이후
한 방울 물로 눈을 튀우고
한 줌 흙으로 싹을 기르리
겨울잠 속에서도 나아가지만
결실은 어느 계절에도 없으리
새로운 폭발[火山]을 위해
오로지 하나
하나의 힘으로 모이는 중이리
항아사를 넘어 아승기에 이를 때까지
- 시 <돌의 여정> 전문
항아사와 아승기는 불교 용어다. 항하(恒河)는 인도 갠지즈강을 말한다. 사(沙)는 모래다. 갠지즈 강의 모래처럼 많다는 뜻이다. 항하사를 항아사라고 시인은 바꿔 명명한 것일까. 아승기(阿僧祇)는 ‘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바위가 저 사막의 모래로 변하는 신비를 알기 위해 사막의 교부들은 지금도 영성의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한다. 산중 스님들은 산문을 닫고 수행에 정진한다.

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술래가 10번 외치는 동안 숨어 버린 친구들을 찾는 놀이다. 이 시를 읽으며 문득 ‘한국의 지성’이라 일컬어지던 이어령 선생의 말씀이 생각난다. 선생은 “해방 후의 아이들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했지만 식민지의 아이들은 학교 마당에서 놀 때에도 '사이타 사이타 사쿠라노 하나가 사이타(피었다 피었다 벚꽃이 피었다)라고 불렀다”고 했다.
이 시는 한국인의 삶을 무궁화꽃에 빗댄 것으로 보인다. ‘북서풍 반만년에 진딧물이 여전하’지만 ‘오천이나 어쩌면 팔천쯤의 꽃잎들’에 둘러싸인 ‘빳빳한 심장’을 지닌 무궁화꽃의 아름다움을, 한국인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술래가 돌아서서 이 대목을 열번 외칠 때
후닥닥 그늘로 숨어드는 말발굽 소리들
따라오던 달빛과 웃음소리까지 사려
어느 틈으로 숨었을까
터어엉 비어버린 놀이터
동무들을 다 잃어버린 술래는
어스름 깊은 적막에 갇히고 나서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눈을 꼭 가리고 정직하게 피워낸 꽃나무를 떠올린다
찬 겨울
북서풍 반만년에 진딧물은 여전하고
오천이나 어쩌면 팔천쯤의 꽃잎들이
둘러둘러 여며주는 빳빳한 심장
붉다*
달무리가 선 다음 날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렸다
- 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전문
시인은 형용사 ‘붉다’에 각주를 넣어 이렇게 설명한다. ‘무궁화는 꽃심 부분이 붉다. 꽃잎의 빛깔에 따라 백단심, 청단심, 홍단심으로 불린다.’
시 〈DMZ〉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시
하늘로 오르지 못한 이무기가 허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어요
살 속 깊은 곳에 수도 없는 가시를 박고 빳빳한 지느러미로 천방지방 날뛰는 청어 떼에게 쫓기고 있어요
뱅글뱅글 도는 머리통을 치켜들고 날뛰는 풍뎅이 툭하면 미사일을 쏘아 올려요
잔등이에서 솟아오르는 붉은 화염에 명치가 뜨끔거려요
물컹거리는 가시에 취해 스스로 삭아 내리는 홍어 떼, 집안싸움이 한창일 때는 햇살과 바람이 맞짱을 뜨고 있네요
한데 바람에 뺨이 시리면
자웅동주 베고니아 빨간 입술이 주문을 외요
올리브의 목소리를 이명처럼 듣고 사는 뽀빠이면 좋겠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려야 저 이무기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까요
- 시
표제 시 <곡선에 관한 명상>은 시인의 시력(詩力)을 알 수 있게 하는 큰 작품이다. 점층적으로 세상에 대한 안목의 깊이를 더해가며 삶의 시원(始原)을 더듬어 간다. 사막의 교부들이 열망하는 영성을 담은 이야기처럼 깊이가 느껴진다. ‘휘어진다’는 것,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어야 한다는 것, 삶이 불협화음으로 이뤄지며, 의미의 빛은 늘상 은폐되어 있어서 진실로 자부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것도 눈에 보이지 않다는 것, 맥 빠지고 무딘 고통의 삶이 때로 칠현금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역설, 그런 명료하지 못한 것이 바로 곡선이요, 휘는 삶일지 모른다. 이 시를 읽으며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그가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가 화가 났다는 것을 모를 뻔했다
그가 화를 냈다면 그의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는 동안 그의 화기가 내게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걸 모를 뻔했다
까닭을 모르는 채 옮겨붙은 불길은 울분으로 차오른다는 것을
울분은 시린 뼈들을 녹이며 설움으로 번져온다는 것도 모를 뻔했다
설움은 울뚝불뚝한 울분의 씨앗을 스스로 견뎌내는 힘이며
견뎌낸다는 것은 스스로 삭아 내린다는 말인 것을
삭아 내리면서 마음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도 모를 뻔했다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직선이던 길이 조금씩 휘어진다는 것
세상의 많은 목숨들이 휘어진 길을 찾아가는 중이며
휜 길만이 우리가 함께 머물던 시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를 뻔했다
시원을 찾아가는 열망이야말로 내 영혼의 밥인 줄 정말 모를 뻔했다
말없이 돌아선 그의 화를 어렴풋이 짐작해본다
날고 뛰고 구르는 그의 발소리 들리는 듯도 하고
골인지점이 보이지 않는 외피를 따라 날마다 뱅뱅이를 도는 듯도 한데
더 휘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근원에 닿을 수 없다는 걸 어떻게 들려주나
- 시 <곡선에 관한 명상> 전문
김예태 시인은 숙명여대와 동대학원(1974년)에서 현대문학을 전공하고 교직생활 후 충북대(2020년)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푸른시학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빈집구경》, 《예술은 좋겠네》 등이 있으며 수필집 《문을 연 아가씨와 문을 닫은 아저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