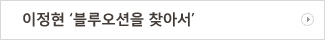- 고야의 그림 <벌거벗은 마야>. 프라도 미술관의 제일 깊숙한 곳에 전시되어 있었다.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서 프란시스 데 고야(Francisco Jose de Goya, 1746~1828)의 <벌거벗은 마야>(작품 제작 시기가 1795~1800년 사이로 추정)를 보았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입가에 살짝, 정말 살짝 미소를 띤 젊은 여인이 침대에 누워 있는 그림이었다. 묘한 느낌을 주었다. 작품 속 모델이 누구냐에 따라 예술이냐 외설이냐를 나뉘는데 당대 스페인에서 외설 논란이 불거져 스캔들이 일었다.
지금도 이 그림은 프라도 미술관 1층 제일 깊숙한 곳에 전시되어 있었다. 벨라스케스의 작품 <시녀들>이 1층 전시실의 가장 중심에 있었고 왼쪽으로 루벤스와 무리요의 작품, 오른쪽으로 엘 그레코와 리베로, 타치아노의 작품이 있었다.
고야의 작품을 보려면 벨라스케스를 지나, 무리요와 루벤스 작품들을 거쳐야 했다. 게다가 고야의 컬렉션만 모은 전시실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벌거벗은 마야>가 위치하고 있었다. 숨기고 싶은 것일까. 관객들을 전시실로 유도하기 위해 그런 배치를 한 것일까.
그로고 보니 전시된 루벤스의 작품 <미의 세 여신>도 벌거벗은 여인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 신화 속 여신들이다. <벌거벗은 마야>의 작품 속 주인공은 종교적 인물이나 신화적 여성과 무관했다. 그런데 그림 양식이 신화에 어울릴 법한 르네상스의 고전 형식의 화풍을 따르고 있어 말썽을 빚었다.
나신(裸身)의 주인공이 이교도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기독교도였다는 점, 실제하는 인물(알바 공작 부인이라는 설이 있지만 확실치는 않다고 한다.)이라는 점, 일설로 고야의 내연녀로 알려져 있다. 결국 스페인 귀족사회에서 큰 논란이 일었음은 물론이다. 재판관 소릴라데 벨라스코가 당시 궁정화가였던 고야를 종교재판에 회부했다고 전한다.
결국 이 그림은 1900년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약 100여 년 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었다. 지금도 미술관의 제일 구석에 놓여 있었다. (<벌거벗은 마야>의 주인이 한때 재상(宰相) 고도이였고, 그는 이 그림을 개인 방에 걸어놓고 즐겼다고 한다.)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서 찍은 마네의 작품 <풀밭 위의 점심식사>. 작품이 매우 컸다. 가로 세로 265× 207cm였다. 전시실 벽면 전체를 채웠다.
<벌거벗은 마야>를 보고 있자니 며칠 전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서 본 마네(Edouard Manet, 1883~1932)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1863년)가 떠올랐다. 이 그림은 오르세 미술관의 5층 전시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었다. 다소 얼굴이 화끈거리는 외설적인 느낌을 주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 앞에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 기자도 덩달아 사진을 찍었다.
그 그림 역시 고야의 그림처럼 벌거벗은 여성 두 명이 나온다. 역시 처음 공개되었을 때 자유분방한 프랑스조차 논란과 조롱이 있었다. 전통적인 누드화의 배경을 깨는 것은 물론이고 작품 속 여인이 신화적 인물도 귀족도 아니었다. 일상에서 나신이 그러진 것이다. 외설논란이 불거졌다.
상상력을 보태 얘기하자면 작품 속 두 여성은 매춘여성이다. 한낮 한적한 공원에서 관계를 가진 뒤의 모습이다. 지팡이를 든 남자가 여성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남성과 여성은 그림을 관람하는 감상자를 빤히 쳐다본다. 볼테면 봐라는 식이다. 한 여성은 개울가에서 몸을 씻고 있다. 마네는 그림 감상자들이 여성의 눈길을 보는 순간 이 뻔뻔하고 자유분방한 상황의 공범자처럼 느끼도록 표현했다. 당대 프랑스 사회가 이 그림을 두고 분노한 이유는 바로 이 ‘공범자 느낌’ 때문이었다고 한다. 도둑이 제 발 저리기 때문?
그리나 프라도 미술관의 제일 먼 전시실에 고야의 <벌거벗은 마야>가 있었지만, 오르세 미술관에서는 5층 넓은 전시관의 한 벽면 전체를 이 그림이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많은 관람객들이 그 앞에 머물렀다가 사진을 찍고 고개를 끄덕였다. 부끄럽게 느끼는 이가 없었다. 어린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비약하자면 스페인은 여전히 가톨릭 국가 같은 엄숙한 분위기의 나라고, 프랑스는 자유분방한 분위기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