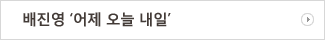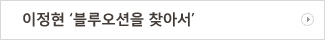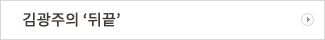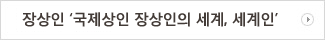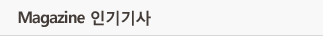- 흰물결 송년 음악회 모습이다.
귓속에 성탄의 눈이 내리고, 객석은 눈밭이 되었다.
송년 음악회를 다녀왔다. 서울 서초구 흰물결 아트센터에서 열린 송년음악회다. 12월 25일 오후 4시부터 2시간가량 음악에 빠져 고요한 눈밭을 걸어가는 느낌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만석(滿席)이 낯설지 않았다.

공연장 안에는 어떤 근심도 보이지 않았다. 옆 사람을 배려한 가벼운 탄성, 일부러 소리를 죽인 박수, 저 음악이, 고운 선율이 관객의 심리를 정확히 짚어내어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하는 망각을 선사했다.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올 한 해를 위한 은수저 위 점점 녹아가는 설탕 같았다.
그 음악 속에는 갈림길이나 네거리가 없었다. 그러니 길을 잃고 헤맬 염려도 없었다. 잘 짜여진 음악극처럼, 연주와 연주 사이 진행자가 나와 감동적인 사연을 엮어주었다. 무덤덤해진 영혼의 한 조각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었다고 할까. 전체적으로 각각의 연주가 헝겊을 덧대어 꿰맨 오색 조각보처럼 잘 짜여 있었다.
다음은 인상적인 진행자의 음악 소갯말이다.
“나와 잘 통하는 남자가 그렇게도 없나. 기도나 해야겠다. 마음먹고 성당에 갔던 날. 한 남자를 만납니다. 이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 저 이야기하면 저 이야기, 찰떡같이 내 마음을 알아줍니다.
걱정을 털어놓아도 금세 웃게 해주는 신기한 사람입니다.
드디어 첫 데이트 날. 준비하는 시간 1분 1초가 설렙니다.
하늘색 스커트에 하얀색 블라우스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어찌나 제가 웃고 있던지. 그가 멀리서 오는데 내가 좋아하는 하늘색 셔츠를 입었네요. 우리는 쑥스럽게 웃으며 서로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도 설렜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하이든의 현악4중주 ‘농담’ 1악장을 들어보세요.”
이런 식의 진행이었다. 드보르작의 ‘둠키’ 2악장, 모차르트 현악 2중주 K423 2악장 아다지오, 쇼스타코비치의 ‘폴카’와 ‘로망스’, 몬티의 ‘차르다시’ 같은 현과 피아노의 실내악이 성탄의 밤을 깊어가게 만들었다. 기자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김효근의 곡 <눈>을 들을 수 있다니... 정지용의 시 <향수>가 눈사람처럼 관객의 마음을 부풀게 만들었다. 다른 콘서트와 달리, '연주자들을 드높이기 위한 곡이 아니라 관객을 염두에 둔' 곡들이었다. 객석의 표정이 모두 밝았다.
연주자의 정성도 빼놓을 수 없다. 곱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윤민영(피아노), 황수빈(바이올린), 장수민(바이올린), 견지아(비올라), 최주연(첼로)의 연주와 소프라노 정지원, 바리톤 김준동의 노래도 서로 어긋남이 없이 내달려 곱게 어우러졌다. 진행자가 나와 연주자 한 명 한 명의 ‘삶’을 요약해 설명해주는데 ‘무슨 상을 받고 무슨 해외 대학을 나왔다’는 표현이 어색했으나 달리 생각하면 젊은 시절, 열심히 땀 흘려 살았다는 진솔한 상장 같았다.

바리톤 김준동과 소프라노 정지원.
레하르(Lehar)의 곡에 흰물결 아트센터 대표인 윤학 변호사가 곡을 붙인 <너의 가슴 숨겨둔 말>이 오래 여운을 주었다. 바리톤 김준동과 소프라노 정지원이 서로 화답하는 노래로 성탄의 밤을 따스하게 수놓았다.
“나의 가슴 속에 숨겨둔 말, 사랑해.
걸음마다 들려온 말, 사랑해.
손끝만 스쳐도 떨려오는 말, ‘나를 사랑한다’고, 마음 다 해.”
사족으로 덧붙이자면, 공연이 끝나고 앙코르 연주도 모두 끝이 난 뒤 흰물결 관계자가 나와 ‘신문팔이’를 했다. 《흰물결 신문》 구독을 부탁하며 “조선일보와 한겨레 지면에 안 나오는, 사그라진 감성과 영성을 깨워 삶을 더욱 지혜롭고 아름답게 하는 신문”이라고 소개했다. 이미 창간호까지 나온 이 신문이 어떤 글을 담았을지 궁금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