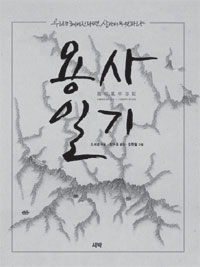타임머신을 타고 시공을 초월하여 417년 전
‘임진왜란’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것 같은 생생한 기록
⊙ 흉악한 불길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연기가 하늘에 가득하다. 대낮에도 어두워서 바로 앞을 분간할 수 없다.(1592년 4월 28일)
⊙ 배득창이 와서 말하기를, “왜적이 사람을 죽이는 참상이란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다. 자네처럼 젊은 사람은 반드시 목이 잘릴 것이야.”(1592년 4월 30일)
⊙ 신흥후산 사방에서 왜적이 구름처럼 모여 성에 불을 질렀다. 겁탈이 더욱 심하고, 살육이 더욱 참혹하였다. 인민들은 이고 지고 부축하고 껴안고 하여 피란을 나섰다.(1592년 5월 26일)
⊙ 운곡에 이르니 형님과 누이는 굶주린 기색이 가득하다. 노복들은 이미 굶어서 죽었다. 외롭고 옹색한 참상이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1594년 3월 18일)
⊙ 밭이랑에서 이삭을 주워서 죽을 끓여 끼니를 이었다.(1594년 3월 25일)
⊙ 동생 복일의 목숨이 목구멍에 걸려 있다. 처음 보리밥을 먹고 숨이 막혔다는 것이다. 동생은 영원히 떠나 버렸다. 어찌 차마 말로 할 수 있겠는가.(1594년 6월 22일)
‘임진왜란’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것 같은 생생한 기록
⊙ 흉악한 불길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연기가 하늘에 가득하다. 대낮에도 어두워서 바로 앞을 분간할 수 없다.(1592년 4월 28일)
⊙ 배득창이 와서 말하기를, “왜적이 사람을 죽이는 참상이란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다. 자네처럼 젊은 사람은 반드시 목이 잘릴 것이야.”(1592년 4월 30일)
⊙ 신흥후산 사방에서 왜적이 구름처럼 모여 성에 불을 질렀다. 겁탈이 더욱 심하고, 살육이 더욱 참혹하였다. 인민들은 이고 지고 부축하고 껴안고 하여 피란을 나섰다.(1592년 5월 26일)
⊙ 운곡에 이르니 형님과 누이는 굶주린 기색이 가득하다. 노복들은 이미 굶어서 죽었다. 외롭고 옹색한 참상이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1594년 3월 18일)
⊙ 밭이랑에서 이삭을 주워서 죽을 끓여 끼니를 이었다.(1594년 3월 25일)
⊙ 동생 복일의 목숨이 목구멍에 걸려 있다. 처음 보리밥을 먹고 숨이 막혔다는 것이다. 동생은 영원히 떠나 버렸다. 어찌 차마 말로 할 수 있겠는가.(1594년 6월 22일)
壬辰倭亂(임진왜란)의 한복판에서 18세 청년이 자신의 艱難辛苦(간난신고)를 생생하게 기록한 <龍蛇(용사)난중일기>가 발견됐다. 星州(성주) 都(도)씨 14세손인 都世純(도세순·1574~1653)이란 젊은이가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4월 13일부터 1595년 1월 15일까지 피란지에서 쓴 총 40쪽(목판본 기준) 분량의 일기다.
도세순은 都夢麒(도몽기)의 둘째 아들로 호는 巖谷(암곡), 자는 厚哉(후재)다. 저서 <京山本誌(경산본지: 성주군에 대한 기록)>와 몇 편의 시문, 일기가 남아있다. 성주 도씨는 고려 창업에 큰 공을 세웠던 都陳(도진)이 정승의 벼슬에 올라 星山府院君(성산부원군) 에 봉해지고 식읍으로 하사 받아 경북 성주에 세거하면서 후손들이 성주를 본관으로 삼게 된 가문이다. 성주 도씨의 종중문서(조선 태조가 성주 도씨 7세손 노은 도응에게 내린 辭令王旨)는 보물 724호로 지정돼 있다.
성주 도씨는 성주 고을에서 학문과 도덕이 높은 가문으로 알려져 왔으며, 典書公派(전서공파), 判書公派(판서공파), 中郞將公派(중랑장공파), 侍丞公派(시승공파), 贊成公派(찬성공파), 市中公派(시중공파), 奉車令公派(봉차령공파) 등 크게 7파로 갈라졌다. 도세순이 쓴 ‘용사난중일기’는 경북 성주의 도씨 가문 종가에 대대로 내려오고 있었던 기록이다.
일기의 제목은 1592년 전란이 시작된 壬辰(임진)년과 이듬해인 1593년 癸巳(계사)년의 2년, 즉 ‘용(龍)과 뱀(蛇) 해의 일기’라는 뜻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세순과 그의 일가 친척 40여 명은 고향인 경북 성주군 운정리 개터마을를 떠나 인근의 여러 산속에 숨어 지냈고, 이어 경북 김천시 증산면 황점리 문예촌,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군위군 의흥면 등을 전전하며 파란만장한 피란생활을 했다.
일기에는 왜적의 살육을 피해 젊은 사람들은 멀리 도망가라는 부모의 눈물 어린 조언, 온 가족이 饑餓(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모습, 戰時(전시)에 극도로 간소하게 치러야 했던 冠禮(관례: 성인식), 어린 동생의 갑작스런 죽음 등 평범한 청년의 눈으로 본 전쟁의 참상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왜적 피해 고난의 행군
임진왜란이 일어난 초기에는 왜적의 살육과 추격으로 공포에 질려 피해 다니는 모습이 주로 기록되어 있고, 1년여가 지난 후에는 식량이 부족해 노비들이 굶어 죽고 도처에서 굶거나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모습이 펼쳐진다.
노비를 데려가기도 했지만 식량이 모자라 버리고 가기도 했고, 산나물을 뜯어 죽을 끓여 먹었지만 그것조차 모자라 가족들은 피골이 상접했고, 어린 동생은 오랜 굶주림 끝에 우연히 얻은 보리밥을 급히 먹다가 목이 메어 죽기도 했다.
<흉악한 불길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연기가 하늘에 가득하다. 대낮에도 어두워서 바로 앞을 분간할 수 없다.(1592년 4월 28일)>
<배득창이 와서 말하기를, “왜적이 사람을 죽이는 참상이란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다. 자네처럼 젊은 사람은 반드시 목이 잘릴 것이야.”(1592년 4월 30일)>
<신흥후산 사방에서 왜적이 구름처럼 모여 성에 불을 질렀다. 겁탈이 더욱 심하고, 살육이 더욱 참혹하였다. 인민들은 이고 지고 부축하고 껴안고 하여 피란을 나섰다.(1592년 5월 26일)>
<운곡에 이르니 형님과 누이는 굶주린 기색이 가득하다. 노복들은 이미 굶어서 죽었다. 외롭고 옹색한 참상이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1594년 3월 18일)>
<밭이랑에서 이삭을 주워서 죽을 끓여 끼니를 이었다.(1594년 3월 25일)>
<동생 복일의 목숨이 목구멍에 걸려 있다. 처음 보리밥을 먹고 숨이 막혔다는 것이다. 동생은 영원히 떠나 버렸다. 어찌 차마 말로 할 수 있겠는가.(1594년 6월 22일)>
선조인 도세순의 일기를 현대어로 번역한 都斗鎬(도두호)씨는 성주 도씨 26세손으로 연세대 철학과와 고려대 대학원 동양철학과를 졸업했으며 과거의 史料(사료)들에 큰 관심을 가져 왔다. 그는 지난해 종중을 통해 전해지던 <용사난중일기>를 현대어로 번역하기로 결심했다.
도씨는 “이 기록이 <亂中日記(난중일기)> 같은 영웅들의 활약상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民草(민초)들이 겪은 임진왜란의 생생한 裏面史(이면사)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번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조들의 행적 따라 10여 차례 현지답사
도씨는 이 일기를 본격적으로 번역하기 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 어린 조카들을 데리고 416년 전 자신의 선조들이 전란을 피하기 위해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던 지역들을 답사했다. 이 여행을 통해 그는 단순히 자신들의 집안 후손들에게만 이 자료가 읽히기보다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뜻 깊은 자료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도씨는 어려운 한자어를 모두 풀어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번역한 후 이를 自費(자비)로 출판하여 사회 각계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이 과정에서 조상들이 미증유의 전란을 피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피란을 다녔던 일기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 서울대 회화과와 同(동) 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한 김현철 화백(現 간송미술관 연구위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도씨는 김 화백과 함께 일기에 나와 있는 선조들의 행적을 따라 10여 차례 경북 일대의 피란 경로를 현지 답사하며 기록을 일일이 고증하고 현지 주민들의 자문을 구한 끝에 여러 장의 지도를 제작했다.
그리하여 ‘우리가 헤어진다면 살아서 무엇하랴’라는 다소 詩的(시적)인 부제를 붙이고, 제목도 <용사일기>라고 붙인 저작을 발간하기에 이른다. 이 책에 수록된 지명은 현재의 행정적 지명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조선시대부터 부르는 명칭이라고 한다. 또 여행 중 모은 자료로 100여 개의 각주를 달아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도씨는 “이 자료의 번역 과정에서 417년 전에 열여덟 청년이 어째서 이토록 비참한 모습을 낱낱이 기록했을까를 깊이 생각하게 됐다”면서 “일가 친척이 굶주림 끝에 무시로 죽어 나가는 참상을 보고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며 성장하는 내용으로 판단돼 후손들에게 읽히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 “이 기록을 통해 볼 때 전쟁은 수많은 民草(민초)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목숨을 앗아 가는 등 큰 폐해를 남겼지만 어려움 속에서 가족애는 더욱 돈독해졌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李成戊(이성무)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前 국사편찬위원장)은 ‘용사난중일기’에 대해 “전쟁의 한가운데에 살았던 평민의 삶을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면서 “지금까지 전해 오는 임진왜란 관련 史料(사료) 중 평범한 일반인이 3년여에 걸쳐 이처럼 세세한 기록을 남긴 것이 흔치 않은 만큼, 이 기록은 微視史(미시사: 巨視史의 반대개념으로, 개별적이고 작은 의미들을 파헤치는 역사)적 시각에서 새로운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평했다.
月刊朝鮮은 번역자인 도세순씨로부터 <용사일기>를 입수하여 그중 하이라이트가 되는 주요 내용을 발췌 소개한다.⊙
도세순은 都夢麒(도몽기)의 둘째 아들로 호는 巖谷(암곡), 자는 厚哉(후재)다. 저서 <京山本誌(경산본지: 성주군에 대한 기록)>와 몇 편의 시문, 일기가 남아있다. 성주 도씨는 고려 창업에 큰 공을 세웠던 都陳(도진)이 정승의 벼슬에 올라 星山府院君(성산부원군) 에 봉해지고 식읍으로 하사 받아 경북 성주에 세거하면서 후손들이 성주를 본관으로 삼게 된 가문이다. 성주 도씨의 종중문서(조선 태조가 성주 도씨 7세손 노은 도응에게 내린 辭令王旨)는 보물 724호로 지정돼 있다.
성주 도씨는 성주 고을에서 학문과 도덕이 높은 가문으로 알려져 왔으며, 典書公派(전서공파), 判書公派(판서공파), 中郞將公派(중랑장공파), 侍丞公派(시승공파), 贊成公派(찬성공파), 市中公派(시중공파), 奉車令公派(봉차령공파) 등 크게 7파로 갈라졌다. 도세순이 쓴 ‘용사난중일기’는 경북 성주의 도씨 가문 종가에 대대로 내려오고 있었던 기록이다.
일기의 제목은 1592년 전란이 시작된 壬辰(임진)년과 이듬해인 1593년 癸巳(계사)년의 2년, 즉 ‘용(龍)과 뱀(蛇) 해의 일기’라는 뜻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세순과 그의 일가 친척 40여 명은 고향인 경북 성주군 운정리 개터마을를 떠나 인근의 여러 산속에 숨어 지냈고, 이어 경북 김천시 증산면 황점리 문예촌,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군위군 의흥면 등을 전전하며 파란만장한 피란생활을 했다.
일기에는 왜적의 살육을 피해 젊은 사람들은 멀리 도망가라는 부모의 눈물 어린 조언, 온 가족이 饑餓(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모습, 戰時(전시)에 극도로 간소하게 치러야 했던 冠禮(관례: 성인식), 어린 동생의 갑작스런 죽음 등 평범한 청년의 눈으로 본 전쟁의 참상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왜적 피해 고난의 행군
임진왜란이 일어난 초기에는 왜적의 살육과 추격으로 공포에 질려 피해 다니는 모습이 주로 기록되어 있고, 1년여가 지난 후에는 식량이 부족해 노비들이 굶어 죽고 도처에서 굶거나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모습이 펼쳐진다.
노비를 데려가기도 했지만 식량이 모자라 버리고 가기도 했고, 산나물을 뜯어 죽을 끓여 먹었지만 그것조차 모자라 가족들은 피골이 상접했고, 어린 동생은 오랜 굶주림 끝에 우연히 얻은 보리밥을 급히 먹다가 목이 메어 죽기도 했다.
<흉악한 불길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연기가 하늘에 가득하다. 대낮에도 어두워서 바로 앞을 분간할 수 없다.(1592년 4월 28일)>
<배득창이 와서 말하기를, “왜적이 사람을 죽이는 참상이란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다. 자네처럼 젊은 사람은 반드시 목이 잘릴 것이야.”(1592년 4월 30일)>
<신흥후산 사방에서 왜적이 구름처럼 모여 성에 불을 질렀다. 겁탈이 더욱 심하고, 살육이 더욱 참혹하였다. 인민들은 이고 지고 부축하고 껴안고 하여 피란을 나섰다.(1592년 5월 26일)>
<운곡에 이르니 형님과 누이는 굶주린 기색이 가득하다. 노복들은 이미 굶어서 죽었다. 외롭고 옹색한 참상이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1594년 3월 18일)>
<밭이랑에서 이삭을 주워서 죽을 끓여 끼니를 이었다.(1594년 3월 25일)>
<동생 복일의 목숨이 목구멍에 걸려 있다. 처음 보리밥을 먹고 숨이 막혔다는 것이다. 동생은 영원히 떠나 버렸다. 어찌 차마 말로 할 수 있겠는가.(1594년 6월 22일)>
선조인 도세순의 일기를 현대어로 번역한 都斗鎬(도두호)씨는 성주 도씨 26세손으로 연세대 철학과와 고려대 대학원 동양철학과를 졸업했으며 과거의 史料(사료)들에 큰 관심을 가져 왔다. 그는 지난해 종중을 통해 전해지던 <용사난중일기>를 현대어로 번역하기로 결심했다.
도씨는 “이 기록이 <亂中日記(난중일기)> 같은 영웅들의 활약상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民草(민초)들이 겪은 임진왜란의 생생한 裏面史(이면사)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번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용사일기> 원문. |
선조들의 행적 따라 10여 차례 현지답사
도씨는 이 일기를 본격적으로 번역하기 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 어린 조카들을 데리고 416년 전 자신의 선조들이 전란을 피하기 위해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던 지역들을 답사했다. 이 여행을 통해 그는 단순히 자신들의 집안 후손들에게만 이 자료가 읽히기보다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뜻 깊은 자료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도씨는 어려운 한자어를 모두 풀어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번역한 후 이를 自費(자비)로 출판하여 사회 각계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이 과정에서 조상들이 미증유의 전란을 피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피란을 다녔던 일기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 서울대 회화과와 同(동) 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한 김현철 화백(現 간송미술관 연구위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도씨는 김 화백과 함께 일기에 나와 있는 선조들의 행적을 따라 10여 차례 경북 일대의 피란 경로를 현지 답사하며 기록을 일일이 고증하고 현지 주민들의 자문을 구한 끝에 여러 장의 지도를 제작했다.
그리하여 ‘우리가 헤어진다면 살아서 무엇하랴’라는 다소 詩的(시적)인 부제를 붙이고, 제목도 <용사일기>라고 붙인 저작을 발간하기에 이른다. 이 책에 수록된 지명은 현재의 행정적 지명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조선시대부터 부르는 명칭이라고 한다. 또 여행 중 모은 자료로 100여 개의 각주를 달아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도씨는 “이 자료의 번역 과정에서 417년 전에 열여덟 청년이 어째서 이토록 비참한 모습을 낱낱이 기록했을까를 깊이 생각하게 됐다”면서 “일가 친척이 굶주림 끝에 무시로 죽어 나가는 참상을 보고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며 성장하는 내용으로 판단돼 후손들에게 읽히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 “이 기록을 통해 볼 때 전쟁은 수많은 民草(민초)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목숨을 앗아 가는 등 큰 폐해를 남겼지만 어려움 속에서 가족애는 더욱 돈독해졌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李成戊(이성무)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前 국사편찬위원장)은 ‘용사난중일기’에 대해 “전쟁의 한가운데에 살았던 평민의 삶을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면서 “지금까지 전해 오는 임진왜란 관련 史料(사료) 중 평범한 일반인이 3년여에 걸쳐 이처럼 세세한 기록을 남긴 것이 흔치 않은 만큼, 이 기록은 微視史(미시사: 巨視史의 반대개념으로, 개별적이고 작은 의미들을 파헤치는 역사)적 시각에서 새로운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평했다.
月刊朝鮮은 번역자인 도세순씨로부터 <용사일기>를 입수하여 그중 하이라이트가 되는 주요 내용을 발췌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