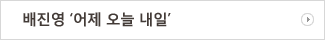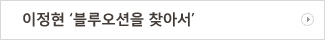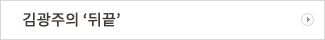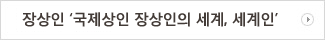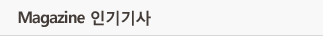파라과이에서 일주일 머무는 동안 이 곳 사람들, 거리, 자연에 정(情)이 들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마찬가지다'는 생각을 하면서 낯설고 물 설은 이국(異國)의 생활이 며칠 새 익숙해 진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무도 없는 거리를 걸어보는 일도, 골목길을 두리번거리는 것도 너무나 좋았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곳이기에 건물하나, 나무 한 그루, 얼굴색이 다른 현지인....모두가 소중했다.
중앙로의 풍물 시장은 아무리 반복해서 들러도 재미가 있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주고받는 눈인사는 신기하리만큼 잘 통했다.
 |
| 풍물시장에서의 할머니와 손녀 |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녀딸을 데리고 나오셨군요."
마음속의 인사를 그들도 환하게 웃으며 눈으로 답례했다. 과라니 족 할머니와 약간은 얼굴색이 달라진 손녀딸의 모습에서 역사의 흔적이 묻어났다.
과라니어는 본디 '아바녜'라고 한다. '아바'는 사람을 의미하고, '녜'는 말하다(hablar)를 뜻한다. 기원전 500년경 아마존 지역에서 살던 '아바-아마소니코'의 후손이다. 그런데 '아바'가 어떻게 해서 '과라니'가 되었을까. 예수회 선교사인 '루이스 데 몬토자'가 처음으로 쓰게 된 말이다(라틴 아메리카 종속의 Matrix, 구경모).
아무튼, 이러한 원주민의 모습을 만나기 쉽지는 않지만, 그들의 언어는 실제적 공용어로써 스페인어와 동일하게 파라과이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
 |
| 잠시 황제가 된 기분으로 구두를 닦은 필자- |
중앙로의 공원에는 풍물 시장에서 구두를 닦는 모습도 볼거리였다. 구두 닦는 비용은 우리 돈으로 1000원 정도였다. 필자는 전 날 '이과수 폭포'에서 더러워진 신발을 닦기 위해서였지만, 새로운 문화 체험이라는 생각에서 왕자처럼 높은 의자에 앉았다. 말이 통했더라면 사람 사는 얘기를 많이 나눴을 텐데, 서로 입을 꽉 다문 채 얼굴 표정과 손놀림만 살폈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구두는 점점 광채를 띠었다.
파라과이의 명물, 마테차
 |
| 수퍼 마켓의 마테차 |
브라질 등 남미 지역에서 들여온 마테차가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파라과이에도 마테차가 많이 나온다. 녹차에 비해 폴리페놀이 3배나 높다는 것과, 면역력 강화는 물론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는 평판이 있다. 이러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현지인들은 마테차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일상의 음료수로 활용하고 있었다. 필자 일행을 안내하는 운전수(니콜라스, 26)도 야간 운전을 할 때 계속적으로 마테차를 마셨다. 잠이 오지 않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심지어 시위를 하는 데모꾼들을 진압하는 경찰들도 마테차 통을 옆구리에 차고 다녔다. 슈퍼마켓에 가면 마테차가 종류별로 진열돼 있다. 스페인 식민지 시절 원주민들은 이 마테차 잎을 따는 일에 투입됐다고 한다. 마테차는 유럽인들에게도 호감이 가는 차(茶)였음에 틀림없다.
 |
| 역사박물관과 녹슨 기찻길- |
아무튼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서 수 백 년 전에 자행됐던 원죄가 새로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중남미 카리브 해 노예무역에 대한 배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다. 카리브 해 연안 14개국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를 상대로 식민지배 당시 노예무역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16-19세기에 걸쳐서 자행된 노예무역으로 인한 인권의 피해는 물론, 식민지배 당시의 노예제도가 국가 발전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까지 배상하라는 것이다(한국일보, 10. 22).
그래서 역사를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언젠가는 부메랑으로 돌아 올 일이기 때문이다.
소고기가 빵보다 싸다
 |
| 식당에서 소고기를 들고오는 현지인의 모습 |
파라과이를 떠나는 마지막 전 날 모처럼 폼 나는 레스토랑에 갔다. 우리의 뷔페식 레스토랑인데, 일단 상추, 당근, 오이 등 싱싱한 야채를 맘껏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에는 빨간 옷을 입은 현지인들이 꼬챙이에 고기를 들고 줄지어 나왔다. 갈비에서부터 안심, 등심...부위별로 연속적으로 공급했다. 우리가 서울에서 브라질 식당에 가면 경험할 수 있겠지만, 이곳 파라과이 식당은 양과 질이 달랐다. 처음에는 배도 고프고 신기해서 그들이 오기가 무섭게 냉큼 받아먹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들이 싫어졌다. 나중엔 그들이 미워지기까지 했다. 그들이 실제로 미울 수가 없다. 그만큼 배가 불렀다는 것이다.
"파라과이 인구보다 소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현지 안내원이 귀띔했다. 자연 환경이 좋아서 목축업이 발달된 덕이다. 인공사료를 먹이지 않으니 육질(肉質)은 얼마나 좋을까.
"남미식 숯불고기인 '아사도(갈비)'는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평가할 수 있지요. 요즈음 송아지 갈비가 1kg에 3$ 정도이고....이민자들은 대부분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17세 때 부모님을 따라 파라과이에 이민 간 명세범 선생의 에세이집 <내 인생 파라과이>에 쓰여 있는 실체적 진실이다. 그렇다.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40%의 빈곤층 해결이 급선무
영웅전 아래로 내려가면 커다란 건물이 하나 나온다. 바로 기차 역사(驛舍) 박물관이다. 기찻길은 이미 녹이 슬어 있었고, 1990년대에 멈춰버린 기차는 기약 없는 개통을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 2004년부터 주말을 이용해서 일부 관광지만 운행한다고 하는데, 철도가 녹이 슬어 있고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어서 더 이상 언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아무튼 중후한 석조 건물 역사(驛舍) 주변에는 노숙자들이 점거하고 있었다. 노숙자 문제는 선진국, 후진국 불문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난제이다.
지난 8월 15일 취임한 오라시오 카르테스(Horacio Cartes, 57) 대통령은 "군사독재정권(1954∼1989년)을 거치면서 형성된 권위주의를 허물겠다"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빈곤감소, 공공부문과 농업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약 7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빈곤층을 해결하는 것이 이 나라의 당면 문제다.
 |
| 안내를 담당했던 니콜라스와 GPF의 서인택씨- |
공항에서 파라과이와 작별했다. 일주일 동안 운전과 안내를 했던 현지인 니콜라스(26)와의 작별도 애틋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스페인어라도 몇 마디 배워서 오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