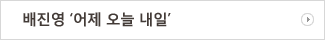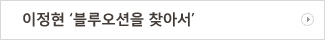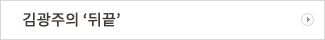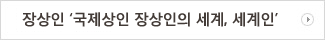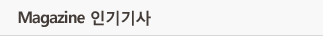아르헨티나에서 브라질로의 국경 통과는 간결했다. 질문도 없이 '빵-' 스탬프 하나로 해결됐다. 브라질 땅의 이과수(Iguazu) 폭포 입구는 아르헨티나와 달리 꽤나 세련돼 있었다. 주차장도 축구장처럼 넓었고, 장식물도 고급스러웠다. 국가의 경제적 레벨은 모든 곳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 입장표를 사러 건물 내로 들어서자 커피 왕국답게 커피숍도 제법 맵시를 뽐내고 있었다.
티켓 검사 후 공원 내부에 들어가자 대형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공원에는 열대 식물들이 무성했고, 고급 호텔도 있었다. '이 호텔에서 일박을 했으면 더욱 좋았을 걸' 생각하면서 버스에서 내렸다.
브라질 쪽의 폭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거진 수풀 사이로 폭포들이 무더기로 눈에 들어왔다. '악마의 목구멍'과는 전혀 다른 형상이었다.
 |
| 수풀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폭포의 파노라마 |
"아니, 이럴 수가? 와!!! "
이 세상에 이러한 폭포가 있다니-. 폭포는 두 겹, 세 겹, 네 겹....층을 이루면서 흘렀다. 아니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악마의 목구멍'에서 영혼을 빼앗겼다면, 여기선 말문이 막혔다. 폭포가 아니라 '감동의 파노라마'였다.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있다. 아르헨티나의 '악마의 목구멍'이 시(詩)라면, 브라질의 폭포는 대하소설(大河小說)이라고. 그렇다. 참으로 그렇다. 폭포는 대하소설처럼 장대한 흐름을 잇고 있었다.
대하소설의 폭포
우거진 수풀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폭포수 물줄기는 모두가 한 폭의 그림이었다. 비탈길의 관광로(觀光路)도 건설 현장의 안전통로처럼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자연도, 사람의 손길도 손색없는 관광자원이었던 것이다. 보다 스펙터클한 볼거리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입구부터 아름다움에 빠져서 진도가 나가질 않았다. 장면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다. 군데군데 마련된 포토라인에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다. 때마침 폭포수 위에 뜬 무지개가 분위기를 더욱 돋웠다.
 |
| 무지개까지 가세해 한폭의 동양화 같은 폭포 |
<연금술사>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소설 <알레프>에서 "무지개를 보고 싶은 자는 비를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필자는 폭포수가 떨어질 때 생성되는 물보라로 비를 대신했다. 물보라와 함께하는 무지개는 더욱 운치를 자아냈다. 사람들의 얼굴에도 너나 할 것 없이 온통 무지개가 떴다. 얼마나 즐거운지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했다.
드디어 대형 폭포의 코앞 다리(橋)에 이르렀다. 폭포는 사람들의 비명(?)과 탄성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만(傲慢)하게 흘렀다. 물보라에 놀라서 비옷을 사려고 했으나, 이미 동이 난지 오래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버린 구겨진 비옷을 하나 골라잡았다. 물보라는 카메라의 렌즈에도 물을 끼얹었다. 사람들은 물보라 속에서도 각기 다른 언어로, 마음껏 소리를 질렀다.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대자연에 맞서는 언어의 향연(饗宴)이었다. 폭포는 말 그대로 정신없이 쏟아졌다. 이 때 폭포수의 색깔이 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
| 서쪽 하늘의 노을이 폭포에 반사돼 황금빛을 띤다. |
"아니, 황금의 물이?"
물론, 폭포에서 쏟아지는 것은 '황금의 물'이 아니었다. 서쪽 하늘의 아름다운 노을이 폭포수에 반사돼서 금빛으로 변했던 것이다.
'아! 황금이 물줄기 속에 섞이어 쏟아지는 구나.'
'칼새(White-Rumped Swift)'의 지혜
필자는 폭포의 턱밑에서 '황금의 물'에 대한 꿈결 같은 환상에 빠져 있다가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다. 거대한 폭포 속으로 돌진하는 작은 새들을 발견했던 것이다. 마치 태평양 전쟁에서 무모하게 미군 함대로 뛰어드는 일본의 가미가제(神風) 특공대처럼 세찬 폭포수의 물줄기 속으로 몸을 던지는 새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름이 '칼새(White-Rumped Swift)'라고 하는 몸길이 18cm의 새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새는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폭포 속으로 돌진하는 것이다. '칼새'가 도마뱀에게 잡혀 먹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안전한 곳을 찾다보니 '폭포수가 안성맞춤이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지혜롭기 그지없다.
'칼새'는 거대한 폭포수의 세찬 물줄기속 암벽에 집을 지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며 살고 있다고 한다. '칼새'가 폭포수 속으로 돌진하는 기술적 노하우(시속 300km)를 연마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력의 결과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다. 도마뱀으로부터 어떠한 공격도 당하지 않는 최고의 안식처를 찾은 것이다. 새들은 석양이 되자 먹이를 물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거센 폭포의 물줄기 속에서 안식처를 찾아낸 작은 '칼새'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위한 지혜를 모으자.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석양은 물보라와 눈물이 섞이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폭포 전망대에서 한 일본인을 만났다. 일본의 고치(高知)현이 고향이라는 야모모토(山田) 씨의 일본어가 어눌했다. '어려서 부모님을 따라 이민 온 브라질 국적의 일본인이다'고 했다. 그와 주고받는 대화가 폭포수 소리 때문에 원만하지 못했으나, '고국이 그립다'는 말은 또렷하게 들렸다. 이국(異國) 생활이 아무리 여유롭다고 해도 내가 태어난 조국만큼 좋은 곳이 또 어디 있을까.
노을은 향수(鄕愁)를 부채질 했다. 나이든 일본인의 눈가에 물보라와 눈물이 섞이고 있었다. 폭포수는 점점 진한 금빛으로 변했다.
 |
| (왼)황금 물결처럼 쏟아지는 폭포, (오)이과수 폭포발견자의 동상 |
폭포수 위 공원으로 오르자 한 동상을 만났다. 이 폭포를 발견한 사람의 동상이었다. 이과수 폭포는 '돈알바르 누네스카베 사데 바카'라는 사람이 1541년에 발견했다. 그는 브라질의 산타카타리나 주를 떠나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으로 가는 도중에 '이과수 폭포'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과수 폭포'의 첫 발견은 원주민이 아닌 백인이었다. 동상의 손은 하얗게 빛이 바랬다. 관광객들이 너도나도 만졌기 때문이란다. 그의 손을 만지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해서다. 석양이 어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돌아가야 할 길이 멀었기에 서둘러야 했다.
'역시 한국인은 어쩔 수 없는 법!'
유명한 브라질 레스토랑을 뒤로하고, 파라과이의 2대 도시 '사우다드 델 에스테(Ciudad del Este)'에서 한국 식당을 찾았다. 그것도 이 도시를 한 바퀴쯤 돌고 난 후에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로 허기는 달랬으나 감동은 없었다.
'사우다드 델 에스테'의 밤은 역시 적막했다. 다음 날 여명(黎明)의 순간에 몰려오는 브라질 고객들을 기다리기 위한 준비 때문이다. 현지인들은 '브라질의 불경기로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의 어려움은 세계 어디를 가도 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느꼈다.
'아순시온'으로 돌아가는 차는 어둠의 밑바닥을 하염없이 질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