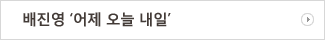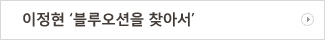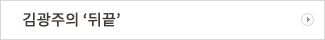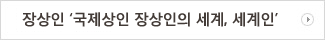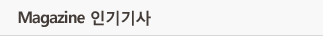"모든 인간은 별이다. 이젠 모두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지만, 그래서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고 누구하나 기억해내려고 조차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건 여전히 진실이다. 한때 우리는 모두가 별이었다."
임철우의 소설 <그 섬에 가고 싶다>는 이렇게 열린다. '모든 인간은 별'이라고......소설 <그 섬에 가고 싶다>는 사랑 이야기를 담은 '소박한 추억록'이다. 작가가 '그 섬에 가고 싶은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을까.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필자도 가보고 싶은 '섬-, 그 섬'이 있었다. 소설 속 '낙일도'가 아닌 일본의 '나오시마(直島)'다. '나오시마(直島)'는 세토(瀨戶) 내해의 시코쿠(四國)에 있는 섬으로 가가와(香川)현 다카마쓰(高松)시로부터 북으로 약 13km 떨어져 있다. 필자가 그 섬에 가고 싶은 이유는 '추억록'이 아닌 한국 작가 이우환(李禹煥, 1936- )의 미술관이 있어서다. 섬에는 이우환 선생의 미술관뿐 아니라 지중 미술관을 비롯한 베넷세(Benesse) 하우스, 집(家) 프로젝트 등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 가득하다. 때 마침 황금연휴라서 인지 '그 섬에 가고 싶은' 일본인들이 참으로 많아 보였다.
다카마쓰(高松) 부두에서 페리를 타고
| 다카마쓰와 나오시마를 왕래하는 페리 |
5월 초라고 해도 더운 날씨였으나 다카마쓰(高松) 부두에 늘어선 긴 행렬의 구성원들은 지루함보다는 즐거움이 넘치는 듯했다. 승선 시간이 되자 긴 행렬은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듯 순식간에 배(船) 속으로 사라졌다. 필자 일행도 일본인들의 대열에 섞여 떠밀리듯이 빨려 들어갔다.
2층 배 안에 제법 많은 좌석이 있었으나, 어느새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다. 의자는 모두 아침 이른 시각부터 앞줄에 섰던 부지런한 자(者)들의 몫이었다. 450명 정원을 일시에 채운 배는 큰 몸집을 틀면서 바닷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입구에서 완장을 찬 안내원들이 섬에 대한 설명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나오시마(直島) 관광 안내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이었다.
나이가 지긋한 오타(太田)씨는 "구리(銅) 제련소였던 섬이 이제는 예술의 섬으로 탈바꿈 했습니다"면서, "지중미술관 · 이우환(李禹煥) 미술관을 꼭 보셔야 합니다"고 말했다. 사람이 많아 안내원을 독차지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필자는 배의 외부 갑판으로 올라갔다. 내해(內海)도 바다는 바다였다.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바람이 세찼다. 그래도 바람결엔 소금기 가득한 바다 내음이 넘쳤고, 하얀 갈매기들이 무리지어 다가왔다가 바람에 밀려 사라지곤 했다. 배를 타는 시간은 1시간 정도. 세토대교(瀨戶大橋, 혼슈와 시코쿠를 연결하는 사장교)가 아스라이 보일 쯤 나오시마(直島)가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배는 긴 경적을 울리면서 지극히 평범한 작은 섬 나오시마(直島)의 미야우라(宮浦) 부두에 큰 몸집을 기대었다. 배가 부두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 나갔고, 목적지가 적혀있는 푯말을 향해 줄지어 섰다. 필자의 행선지는 일단 지중미술관이었다. 작은 마을버스는 사람들로 꽉 찼다. 1인당 100엔이라는 저렴한 이유도 있지만, 차가 없는 사람들은 이 버스가 유일한 구세주다. 배에 자동차를 싣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전거를 빌려서 배에 싣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대부분 마을버스 신세를 졌다.
관람 시간을 놓친 지중미술관
| 입장권을 사기위해 줄서있는 관람객들 |
지중 미술관은 "자연과 인간을 생각하는 장소"로 2004년에 설립됐다. 나오시마(直島)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건물의 대부분이 지하에 건설된 것이 특징이다. 건물은 유명 건축가 안도다다오(安藤忠雄, 1941- ) 선생의 작품이다.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 월터 드 마리아(Walter De Maria). 3명의 작품만 작품이 전시돼 있는 미술관은 지하이면서 자연광이 쏟아져 작품이나 공간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화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지중미술관 앞에서 다시 줄을 섰다. 그 때 시각이 오전 11시- 마이크를 잡은 미술관 직원이 줄지은 사람들을 향해 목청을 높였다.
"여러분께서 구매하실 티켓은 오후 4시 30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카마쓰(高松)로 돌아가는 마지막 배가 오후 5시인데, 입장이 4시 반이라니......"
필자 일행은 지중미술관 관람을 포기하고 섬의 비탈길을 내려갔다. 이우환 미술관으로 발길을 돌린 것이다. 나오시마(直島)의 나무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게 연두색 이파리들을 고물고물 움틔우고 있었다. 10여분 쯤 산허리를 돌아서 내려가자 푸른 바다가 다시 펼쳐졌다. 푸른 산과 바다, 그리고 높은 하늘- 지상 낙원이 따로 없었다.
이우환(李禹煥) 미술관
| 이우환미술관의 입구 |
"어디서 오셨습니까?"
"오사카(大阪)에서 왔습니다."
"이우환 선생을 좋아 하시나요?"
"이우환 선생요? 아닙니다. 이우환 씨는 잘 모릅니다. 저는 안도다다오(安藤忠雄) 선생을 좋아합니다. 그의 건축물 사진을 찍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우환 선생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국인 입니까?"
| 동굴 이미지의 이우환 미술관의 입구 통로 |
일본인들은 이우환 선생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래도 필자는 자부심을 느꼈다. 우리가 이우환이라는 훌륭한 작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영광이요, 보람이기 때문이다. 이우환 미술관 입구에는 철판과 자연석을 이용한 <관계항> 등 작품이 잔디밭에 자리하고 있었고, 높이 18.5m의 6각형 콘크리트 기둥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입장권을 사서 건물 내부로 들어서자 좁고 긴 통로는 마치 동굴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높이 6m, 길이 50m의 삼중 벽으로 구성된 동굴형 통로는 '태내(胎內)로의 회귀(回歸)'를 의미한다고 했다.
| 이우환의 '선으로 부터' 방 |
'만남의 방' '침묵의 방' 그림자 방' '명상의 방'에는 15점 정도의 그림과 조각품들이 있었다. '선(線)으로 부터' '점으로 부터' 등 낯익은 작품들이 있었고, '명상의 방'에는 벽면 하나에 작품 하나씩이 그려져 있었다. 미술관 직원은 "이우환 선생이 나오시마(直島)에 머물면서 직접 하얀 벽에 새긴 그림이다"고 했다. "방에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해서 밖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른 방으로 이동했다. 그다지 크지 않은 좁은 공간의 미술관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왔다. 하루에 400명 정도의 관람객이 찾아든다고 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