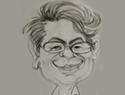- 부산 남구을 김무성(친박 무소속연대) 무소속 후보가 2008년 4월 9일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확정되자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사진=조선DB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심사에서 떨어진 정치인들의 탈당 후 무소속이나 신당(혹은 경쟁 정당)입당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당사자들은 “비명횡사”라거나 “불공정·꼼수 공천”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나 선거철이면 반복돼왔던 통과의례였기도 하다. 그만큼 이들의 출마행보가 선거판에서 탄력받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이다. 탈당보다는 당에 잔류, 후일을 기약하는 쪽이 많았던 데는 이 같은 상황이 적잖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탈당해 출마한 후보들이 당선됐던 사례들도 상당했지만 그럴만한 명분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했던 것이다. 한나라당이 ‘친박 공천학살’ 논란에 휩싸였던 2008년 총선 때가 그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친박(박근혜)계 의원들이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자 탈당, 친박연대 혹은 친박무소속 연대로 출마해 선전했던 것이다.
선거결과 친박연대의 경우 영남권을 중심으로 지역구 6석을 차지했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13.2%를 득표, 8석을 얻었다. 비례대표 득표율은 3당이었던 자민련(18석)보다 높았을 정도였다.
친박연대와 공조했던 친박무소속연대도 김무성 후보를 비롯해 영남권 등의 선거구에서 12명이나 당선시켰다. 친박을 내세운 양측 당선자들을 합칠 경우에는 26명이나 됐으며, 자민련보다 많았다.
이들이 탈당해 대거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공천 학살’ 때문이란 출마명분이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의 지지세력이란 점과 맞물리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 의원이 한나라당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 이들을 향해 “살아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표심을 더욱 몰아줬던 것이다.

2016년 2월 26일 오전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진박 vs 비박’ 대결로 4·13총선 최대 관심지로 떠오른 대구·경북지역 공천신청자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조선DB
박근혜정부 말기인 2016년 총선 때도 마찬가지. 공천심사에서 밀려나 탈당·출마했던 비박 의원다수를 당선시켰던 지렛대 역시 ‘비박 공천학살·진박논란’이었던 것이다. 당시 집권당 역학구도가 비박 쪽으로 기울고 있었던 데다 친박 측에선 차기 대선주자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상황과도 맞물려 있었다. ‘공천학살’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친박 측이었기에 레임덕으로 치닫고 있던 박 대통령 상황까지 감안할 경우 정치적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고 결국 무리수를 뒀던 것이다.
2000년 총선 때는 약발이 먹혀들지 않았다. 이회창 후보의 킹메이커였던 김윤환 고문이 이기택 고문과 신상우 전 국회부의장 등 함께 공천학살 됐던 한나라당 중진들과 민주국민당을 창당, 선거판에 뛰어들었으나 참패했다. 비례대표 1석을 포함, 2석을 얻는 데 그쳤던 것. 민국당은 새천년민주당에서 낙천됐던 동교동계 중진 김상현 의원까지 영입, 한나라당 텃밭인 영남권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을 10명이나 확보하는 등 세(勢) 과시를 했으나 득표에선 무기력했다.
당시 선거에선 “공천 학살”이란 출마명분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 년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한나라당 지지층의 표심에는 공천학살 논란보다 정권교체론이 더욱 주효했던 것이다. 민국당이 영남에서 전패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명분싸움에서 공천학살 주장이 정권교체론에 밀렸던 셈이다.

민주국민당은 2000년 3월 9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조순 대표, 허화평 김상현 전 의원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있다. 사진=조선DB
이처럼 탈당 출마가 다른 명분보다 강한 설득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 출마 후보들의 당락이 갈릴 수 있는 것이다. 공천에서 떨어진 상황에서 탈당 명분조차 변변치 못할 경우에는 출마해도 낙선하기 십상인 것이다. 탈당하기 전 자신의 지지기반이었던 소속당의 지지층을 상대로 탈당 명분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쟁정당에 입당한 경우에는 당의 지지층을 흡수해나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우리 선거판은 양대 정당을 기반으로 한 지역주의 표심까지 견고, 설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후보가 어느 정당에 소속돼 있는지, 그 정당의 텃밭지역인지, 그리고 소속정당의 지지율에 따라 당락이 크게 좌우돼 왔던 것이다. 인물론은 부차적이었을 뿐이다. 때문에 소속됐던 정당의 지지층 표심을 의식, 다른 당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무소속 출마를 택하기도 했다.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나아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무소속은 물론이고 신당의 출마자들도 조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득표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결국 공천학살에 따른 탈당이란 출마명분이 경쟁 정당(후보) 측이 내건 명분보다 표심에서 앞설 수 있을지가 당락의 핵심 관건인 셈이다. 신당 후보 측이라면 선거판을 뒤흔들 바람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것 역시 자신들이 내세운 창당명분이 표심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는 명분싸움이라고도 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공천심사에 불복, 탈당한 후보들의 당락 향배는 마찬가지다. 각자의 탈당이 경쟁 명분보다 앞설 수 있는지를 되짚어보면 가늠되는 것이다. 특히 무소속 출마자들에게는 양대 정당들이 내건 국정안정론(야당심판론)이나 정권심판론 같은 명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차기 대선정국이 2년여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점도 이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