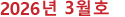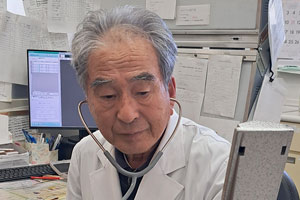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맹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향해 치닫고 있던 1947년 3월 하순, 뉴욕 맨해튼 40번가의 호텔 바에서 작가와 사진기자가 만난다. ‘솔직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논의하던 두 사람은 불현듯 ‘러시아에는 아무도 글로 쓰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데에 생각이 미친다. 두 사람은 스탈린의 야욕, 러시아의 군비 증강 같은 이야기들 말고 ‘러시아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쓰자고 뜻을 모은다.
이들은 소련 당국으로부터 입국 허가를 얻어 두 달 동안 소련, 즉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일대를 여행하고 난 후 기행문을 남긴다. 이들은 공산체제의 관료주의 시스템과 물자 부족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당국이 가져간 사진 필름을 돌려주지 않을까 봐 마음을 졸인다. 그러다가도 가는 곳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이나 집단농장의 농부들과 자유롭게(?) 만나 진수성찬을 대접받으면서, 미국의 삼권분립 체제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는가 하면, ‘전쟁 없는 세상’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기도 한다.
아쉽게도 두 사람은 소련 체제의 ‘보이지 않는 이면’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런 점에서는 1980~1990년대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류의 방북기(訪北記)를 연상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재미있다. 그럴 수밖에! 작가는 퓰리처상과 노벨문학상을 받은 존 스타인벡, 사진기자는 전설적인 종군 사진기자 로버트 카파이기 때문이다. 자기 나라의 시스템이 제일 진보적이고 창의적이라고 믿으며 사는 러시아인들, 모스크바에 비해 한결 공기가 자유로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묘사를 보면, 7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들은 소련 당국으로부터 입국 허가를 얻어 두 달 동안 소련, 즉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일대를 여행하고 난 후 기행문을 남긴다. 이들은 공산체제의 관료주의 시스템과 물자 부족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당국이 가져간 사진 필름을 돌려주지 않을까 봐 마음을 졸인다. 그러다가도 가는 곳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이나 집단농장의 농부들과 자유롭게(?) 만나 진수성찬을 대접받으면서, 미국의 삼권분립 체제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는가 하면, ‘전쟁 없는 세상’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기도 한다.
아쉽게도 두 사람은 소련 체제의 ‘보이지 않는 이면’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런 점에서는 1980~1990년대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류의 방북기(訪北記)를 연상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재미있다. 그럴 수밖에! 작가는 퓰리처상과 노벨문학상을 받은 존 스타인벡, 사진기자는 전설적인 종군 사진기자 로버트 카파이기 때문이다. 자기 나라의 시스템이 제일 진보적이고 창의적이라고 믿으며 사는 러시아인들, 모스크바에 비해 한결 공기가 자유로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묘사를 보면, 7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