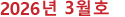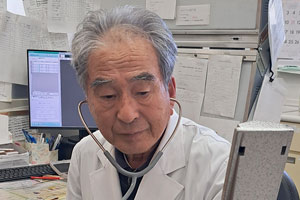재벌 2세와 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주주로 있는 브이소사이어티가 해체수순을 밟고 있다.
브이소사이어티의 관계자는 “주식회사인 브이소사이어티가 해산절차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이 법인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과 벤처의 상생 모델 구축’이라는 취지로 지난 2000년 9월에 출범한 브이소사이어티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결국 14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초창기에 ‘재벌과 벤처인의 비밀스런 모임’이라는 시선을 받았던 브이소사이어티는 최근에는 안철수(安哲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주주였다는 이유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특히 안 대표가 브이소사이어티 멤버 자격으로 지난 2003년, 당시 비자금으로 구속된 최태원(崔泰源) SK회장의 구명운동을 벌였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안 대표가 대선을 치르던 지난 2012년의 일이다. 당시 브이소사이어티는 안철수 대표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자료가 됐다. 반(反)재벌 성향을 보인 안철수 대표의 ‘화려한 재벌인맥’으로도 불렸고, 일부에서는 ‘이 모임이 안철수 대표의 후원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지난 14년 동안 브이소사이어티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웅열 코오롱 회장, 김준 경방 사장이 주도
브이소사이어티의 초기 멤버는 총 21명이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辛東彬) 롯데그룹 회장, 이웅열(李雄烈) 코오롱그룹 회장, 정용진(鄭溶鎭) 신세계 총괄 대표이사, 김준(金畯) 경방 사장, 이홍순(李洪淳) 전(前) 삼보컴퓨터 회장, 정몽규(鄭夢奎)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이 참여했다. 벤처에서는 안철수 당시 안철수연구소 대표이사,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 변대규 휴맥스 대표 등이 참여했다. 지난 2000년을 전후해 국내에는 벤처열풍이 불고 있었다. 이 모임을 기획·세팅한 것은 김준 사장과 이웅열 회장이었다. 이들은 이미 ‘미니 전경련’이라고 불리는 ‘YPO(Young Presidents Organization)’의 멤버였다. 199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YPO’는 재벌 2세들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자는 취지로, 당시 만 40세 이하의 재벌 2세들로 꾸려진 모임이었다. 이 모임에서 함께 활동한 김준 사장과 이웅열 회장은 벤처 붐이 일게 되자, 이번에는 재벌 2세와 벤처기업인들 간의 모임을 만들어 보자고 얘기했다. 이것이 브이소사이어티다. ‘브이’는 ‘벤처(Venture)’의 머리 글자다. 그리고 이들 후배의 얘기를 들은 최태원 SK 회장이 흔쾌히 모임에 동참할 뜻을 밝혔고, 어떤 벤처 기업인을 멤버로 할 것인지가 논의됐다. 당시 백신회사로 이름을 알린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해서 브이소사이어티 멤버가 됐다.
브이소사이어티 관계자는 “초창기 모임의 의도는 순수했다. 커리큘럼에 따라서 매주 1회 비공개 세미나를 하고, 3회 연속 빠지면 회원 자격을 박탈하자는 규칙을 세웠다. 제대로 된 사무실을 만들고, 모임을 관리할 CEO를 선임하자는 취지로 회원들이 각 2억원씩을 냈다. 처음부터 주식회사로 출범하고 강남구 청담동에 번듯한 사무실을 만들어 시작한 것도 이 모임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지난 2000년 9월, 자본금 총 42억원의 브이소사이어티법인이 탄생했다. 당시 삼성증권 기획담당 이사였던 이형승씨를 CEO로 선임했다.
최태원 회장이 모임에 꼬박꼬박 참여하며 순조로운 출발
출발은 순조로웠다. 이들이 모임을 하는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요리사가 회원들을 위해 요리를 했다.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회원 21명의 손을 청동으로 본뜬 액자가 걸려 있었고, 널찍한 응접실에 멤버들이 모여들었다.
일부에서 ‘재벌과 벤처기업의 석연찮은 동거’라는 식(式)의 눈길을 보내자, 세미나 포럼을 외부에 공개할 정도로 모임에 대해 멤버들은 자신감을 보였다. 무엇보다 최태원 회장이 모임에 열심이었다. 브이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얘기다.
“후배들의 얘기를 듣고 모임에 참여했지만 누구보다 최태원 회장이 열성적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모임에 꼬박꼬박 참여했습니다. 최 회장이 직접 포럼에서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제휴와 협력’에 대해 강연 형식으로 발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브이소사이어티 내에서 가장 큰 그룹의 회장이 열성적이다 보니 다른 이들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재벌보다는 벤처기업인들이 더 열심이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요.
“안철수 박사(그는 여전히 안철수 대표를 박사라고 칭했다) 역시 초창기에는 열심히 나왔다가 나중에는 한두 달에 한 번 꼴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브이소사이어티 멤버 중에서 안 박사가 정확히 몇 번이나 나왔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안 박사는 모임 내에서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해서도 듣다가 가는 일이 잦았고, 한쪽에 마련된 미니 음료바에서 술 한 잔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브이소사이어티로서는 안 박사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자꾸 거론이 돼서 탐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세미나 모임에 열심히 나왔던 사람은 최태원 회장 외에 김준 사장, 구본능(具本綾) 희성그룹 회장, 변대규 휴맥스 사장, 권도균 당시 이니시스 사장, 윤재승 대웅제약 부회장 등이었다. 반면 이름만 올렸을 뿐 모임에 얼굴을 거의 비치지 않은 이도 있다. 이 관계자는 “신동빈 부회장과 류진(柳津) 풍산 회장은 모임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얘기 나오자, 재벌 2세 전원 발길 끊어
이곳에서 논의됐던 것은 오늘날 생각하면 꽤 긍정적인 내용들이었다. 브이소사이어티의 또 다른 관계자의 말이다.
“재벌과 벤처가 가진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윈윈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기본 취지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재벌그룹들끼리 동일한 해외 시장에 진출해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우리끼리 외국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얘기를 해 보자는 뜻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 벤처가 막 붐이 일기 시작했지만 향후 재벌 독점으로 인해 벤처가 더 커져 나가기 힘드니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뜻도 있었습니다. 미국식의 벤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앞세워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투자받아 회사를 키운 뒤에 더 큰 회사에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벤처 모델이 없었습니다. 벤처 회사를 만든 사람이 끝까지 그 회사를 책임지고 이끌고 가는 것이 벤처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키운 뒤에 더 큰 곳에 팔아 이윤을 남기고, 또 다른 벤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우리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죠. 큰 회사가 관심을 보이면 무조건 재벌이 독점하느냐는 논리를 들이댔는데 이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장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여력이 되면 우리 스스로 그런 벤처 회사에 투자해서 키워 보자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브이소사이어티의 이런 취지는 꽃을 피우기는커녕 몽우리가 맺히기도 전에 위기를 맞는다. SK비자금 사태로 인해 최태원 회장이 구속돼서다. 멤버를 지속적으로 영입한 끝에 한때 회원수가 58명까지 늘었지만,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 수는 점차 줄고 있었다. 이들이 초창기에 내놓은 자본금 2억원은 사무실 임대료, 이형승씨의 월급으로 점차 소진되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법인을 해산하자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브이소사이어티 관계자는 “처음 의도대로 세미나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 모일 수 있으니 사무실을 그냥 두자는 얘기가 많았고 또 언젠가는 다시 활발해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다”며 “재벌보다 벤처 기업인들이 모임으로 이어 가는 데 관심이 컸다”고 말했다.
그렇게 브이소사이어티는 세간의 기억 속에서, 또 멤버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잊혀 갔다. 하지만 법인은 그대로 살아 있었다. 브이소사이어티가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안철수 대표가 대선출마를 선언한 지난 2012년이었다. 외부에서는 이 모임이 안철수 대표의 ‘재계 인맥’인 양 포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 멤버 중에서 최근 5~6년간 안철수 대표를 만난 적도 없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브이소사이어티 관계자의 말이다.
“안철수 대표랑 연결되면서 모임이 정치랑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뜸하지만 세미나에 나왔던 재벌 2세들이 안철수 대표 얘기가 나오면서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치와 엮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재벌가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안철수가 긴밀하게 엮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아예 등을 돌려 버린 겁니다. 모임 초창기부터 열심이었던 변대규 사장의 입장은 난처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변 사장과 친분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대뜸 정치권에서 변 사장을 두고 ‘안철수의 어드바이저로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는 멤버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변대규 사장이 오너인 벤처회사 ‘휴맥스’는 안철수 대표와의 친분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2012년 1월 2일 증시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12년 6월, 증권가를 중심으로 안철수재단 이사진에 변대규 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휴맥스’ 주가는 지난 6월 26일 개장 직후 약 10%가 치솟기도 했다. 물론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었다.
올 초 법인 해산 결정
이렇게 되자 브이소사이어티 주주들 사이에서는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말고 법인을 해산하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끝까지 막은 사람은 김준 경방 사장으로 전해진다.
브이소사이어티 관계자는 “김 사장이 브이소사이어티를 태동시킨 사람으로서 애착이 남달랐다. 모임에서 탈퇴하고 싶은 사람은 차라리 본인에게 지분을 팔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애착을 보였다”며 “모임의 설립취지가 좋은 뜻이었는데 꿈을 펼치지 못하고 접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해산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의 뜻은 결국 꺾이고 말았다. 안철수 대표가 정치생활을 계속 이어 가면서, 일부에서 “브이소사이어티가 안철수의 뒷돈을 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결국 브이소사이어티는 올 초, 법인을 해산하고 남은 금액을 주주들에게 되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10일, 브이소사이어티는 내한한 ‘런던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관람을 끝으로 마지막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준 사장과 현재 브이소사이어티 대표를 맡고 있는 유용석(劉勇碩) 한국정보공학 대표이사 부부와 딸, 구본능 회장을 대신해 부인과 딸 등 조촐한 인원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승철(李承哲)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지난 4월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브이소사이어티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 만든 모임이었다. 요즘 식으로 하면 ‘창조경제’를 갈망하던 모임이었다. 브이소사이어티 같은 모임이 많이 만들어져야 하고, 거기서 새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푼 꿈을 안고 시작된 모임은 결국 한 멤버가 정치인으로서 인생을 걷기 시작한 때문에 이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채 조용히 사라질 전망이다.⊙
브이소사이어티의 관계자는 “주식회사인 브이소사이어티가 해산절차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이 법인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과 벤처의 상생 모델 구축’이라는 취지로 지난 2000년 9월에 출범한 브이소사이어티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결국 14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초창기에 ‘재벌과 벤처인의 비밀스런 모임’이라는 시선을 받았던 브이소사이어티는 최근에는 안철수(安哲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주주였다는 이유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특히 안 대표가 브이소사이어티 멤버 자격으로 지난 2003년, 당시 비자금으로 구속된 최태원(崔泰源) SK회장의 구명운동을 벌였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안 대표가 대선을 치르던 지난 2012년의 일이다. 당시 브이소사이어티는 안철수 대표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자료가 됐다. 반(反)재벌 성향을 보인 안철수 대표의 ‘화려한 재벌인맥’으로도 불렸고, 일부에서는 ‘이 모임이 안철수 대표의 후원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지난 14년 동안 브이소사이어티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웅열 코오롱 회장, 김준 경방 사장이 주도
브이소사이어티의 초기 멤버는 총 21명이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辛東彬) 롯데그룹 회장, 이웅열(李雄烈) 코오롱그룹 회장, 정용진(鄭溶鎭) 신세계 총괄 대표이사, 김준(金畯) 경방 사장, 이홍순(李洪淳) 전(前) 삼보컴퓨터 회장, 정몽규(鄭夢奎)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이 참여했다. 벤처에서는 안철수 당시 안철수연구소 대표이사,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 변대규 휴맥스 대표 등이 참여했다. 지난 2000년을 전후해 국내에는 벤처열풍이 불고 있었다. 이 모임을 기획·세팅한 것은 김준 사장과 이웅열 회장이었다. 이들은 이미 ‘미니 전경련’이라고 불리는 ‘YPO(Young Presidents Organization)’의 멤버였다. 199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YPO’는 재벌 2세들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자는 취지로, 당시 만 40세 이하의 재벌 2세들로 꾸려진 모임이었다. 이 모임에서 함께 활동한 김준 사장과 이웅열 회장은 벤처 붐이 일게 되자, 이번에는 재벌 2세와 벤처기업인들 간의 모임을 만들어 보자고 얘기했다. 이것이 브이소사이어티다. ‘브이’는 ‘벤처(Venture)’의 머리 글자다. 그리고 이들 후배의 얘기를 들은 최태원 SK 회장이 흔쾌히 모임에 동참할 뜻을 밝혔고, 어떤 벤처 기업인을 멤버로 할 것인지가 논의됐다. 당시 백신회사로 이름을 알린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해서 브이소사이어티 멤버가 됐다.
브이소사이어티 관계자는 “초창기 모임의 의도는 순수했다. 커리큘럼에 따라서 매주 1회 비공개 세미나를 하고, 3회 연속 빠지면 회원 자격을 박탈하자는 규칙을 세웠다. 제대로 된 사무실을 만들고, 모임을 관리할 CEO를 선임하자는 취지로 회원들이 각 2억원씩을 냈다. 처음부터 주식회사로 출범하고 강남구 청담동에 번듯한 사무실을 만들어 시작한 것도 이 모임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지난 2000년 9월, 자본금 총 42억원의 브이소사이어티법인이 탄생했다. 당시 삼성증권 기획담당 이사였던 이형승씨를 CEO로 선임했다.
최태원 회장이 모임에 꼬박꼬박 참여하며 순조로운 출발
출발은 순조로웠다. 이들이 모임을 하는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요리사가 회원들을 위해 요리를 했다.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회원 21명의 손을 청동으로 본뜬 액자가 걸려 있었고, 널찍한 응접실에 멤버들이 모여들었다.
일부에서 ‘재벌과 벤처기업의 석연찮은 동거’라는 식(式)의 눈길을 보내자, 세미나 포럼을 외부에 공개할 정도로 모임에 대해 멤버들은 자신감을 보였다. 무엇보다 최태원 회장이 모임에 열심이었다. 브이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얘기다.
“후배들의 얘기를 듣고 모임에 참여했지만 누구보다 최태원 회장이 열성적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모임에 꼬박꼬박 참여했습니다. 최 회장이 직접 포럼에서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제휴와 협력’에 대해 강연 형식으로 발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브이소사이어티 내에서 가장 큰 그룹의 회장이 열성적이다 보니 다른 이들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재벌보다는 벤처기업인들이 더 열심이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요.
“안철수 박사(그는 여전히 안철수 대표를 박사라고 칭했다) 역시 초창기에는 열심히 나왔다가 나중에는 한두 달에 한 번 꼴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브이소사이어티 멤버 중에서 안 박사가 정확히 몇 번이나 나왔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안 박사는 모임 내에서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해서도 듣다가 가는 일이 잦았고, 한쪽에 마련된 미니 음료바에서 술 한 잔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브이소사이어티로서는 안 박사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자꾸 거론이 돼서 탐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세미나 모임에 열심히 나왔던 사람은 최태원 회장 외에 김준 사장, 구본능(具本綾) 희성그룹 회장, 변대규 휴맥스 사장, 권도균 당시 이니시스 사장, 윤재승 대웅제약 부회장 등이었다. 반면 이름만 올렸을 뿐 모임에 얼굴을 거의 비치지 않은 이도 있다. 이 관계자는 “신동빈 부회장과 류진(柳津) 풍산 회장은 모임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얘기 나오자, 재벌 2세 전원 발길 끊어
 |
| 브이소사이어티 활동에 열심이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002년 구속되면서 모임이 뜸해졌다. |
“재벌과 벤처가 가진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윈윈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기본 취지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재벌그룹들끼리 동일한 해외 시장에 진출해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우리끼리 외국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얘기를 해 보자는 뜻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 벤처가 막 붐이 일기 시작했지만 향후 재벌 독점으로 인해 벤처가 더 커져 나가기 힘드니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뜻도 있었습니다. 미국식의 벤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앞세워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투자받아 회사를 키운 뒤에 더 큰 회사에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벤처 모델이 없었습니다. 벤처 회사를 만든 사람이 끝까지 그 회사를 책임지고 이끌고 가는 것이 벤처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키운 뒤에 더 큰 곳에 팔아 이윤을 남기고, 또 다른 벤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우리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죠. 큰 회사가 관심을 보이면 무조건 재벌이 독점하느냐는 논리를 들이댔는데 이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장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물론 여력이 되면 우리 스스로 그런 벤처 회사에 투자해서 키워 보자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브이소사이어티의 이런 취지는 꽃을 피우기는커녕 몽우리가 맺히기도 전에 위기를 맞는다. SK비자금 사태로 인해 최태원 회장이 구속돼서다. 멤버를 지속적으로 영입한 끝에 한때 회원수가 58명까지 늘었지만,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 수는 점차 줄고 있었다. 이들이 초창기에 내놓은 자본금 2억원은 사무실 임대료, 이형승씨의 월급으로 점차 소진되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법인을 해산하자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브이소사이어티 관계자는 “처음 의도대로 세미나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 모일 수 있으니 사무실을 그냥 두자는 얘기가 많았고 또 언젠가는 다시 활발해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다”며 “재벌보다 벤처 기업인들이 모임으로 이어 가는 데 관심이 컸다”고 말했다.
그렇게 브이소사이어티는 세간의 기억 속에서, 또 멤버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잊혀 갔다. 하지만 법인은 그대로 살아 있었다. 브이소사이어티가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안철수 대표가 대선출마를 선언한 지난 2012년이었다. 외부에서는 이 모임이 안철수 대표의 ‘재계 인맥’인 양 포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 멤버 중에서 최근 5~6년간 안철수 대표를 만난 적도 없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브이소사이어티 관계자의 말이다.
“안철수 대표랑 연결되면서 모임이 정치랑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뜸하지만 세미나에 나왔던 재벌 2세들이 안철수 대표 얘기가 나오면서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치와 엮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재벌가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안철수가 긴밀하게 엮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아예 등을 돌려 버린 겁니다. 모임 초창기부터 열심이었던 변대규 사장의 입장은 난처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변 사장과 친분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대뜸 정치권에서 변 사장을 두고 ‘안철수의 어드바이저로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는 멤버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변대규 사장이 오너인 벤처회사 ‘휴맥스’는 안철수 대표와의 친분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2012년 1월 2일 증시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12년 6월, 증권가를 중심으로 안철수재단 이사진에 변대규 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휴맥스’ 주가는 지난 6월 26일 개장 직후 약 10%가 치솟기도 했다. 물론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었다.
올 초 법인 해산 결정
 |
| 안철수 대표와의 친분으로 안 대표 캠프에 참여하지 않겠냐는 시선을 받았던 변대규 휴맥스 사장. |
브이소사이어티 관계자는 “김 사장이 브이소사이어티를 태동시킨 사람으로서 애착이 남달랐다. 모임에서 탈퇴하고 싶은 사람은 차라리 본인에게 지분을 팔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애착을 보였다”며 “모임의 설립취지가 좋은 뜻이었는데 꿈을 펼치지 못하고 접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해산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의 뜻은 결국 꺾이고 말았다. 안철수 대표가 정치생활을 계속 이어 가면서, 일부에서 “브이소사이어티가 안철수의 뒷돈을 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결국 브이소사이어티는 올 초, 법인을 해산하고 남은 금액을 주주들에게 되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10일, 브이소사이어티는 내한한 ‘런던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관람을 끝으로 마지막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준 사장과 현재 브이소사이어티 대표를 맡고 있는 유용석(劉勇碩) 한국정보공학 대표이사 부부와 딸, 구본능 회장을 대신해 부인과 딸 등 조촐한 인원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승철(李承哲)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지난 4월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브이소사이어티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 만든 모임이었다. 요즘 식으로 하면 ‘창조경제’를 갈망하던 모임이었다. 브이소사이어티 같은 모임이 많이 만들어져야 하고, 거기서 새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푼 꿈을 안고 시작된 모임은 결국 한 멤버가 정치인으로서 인생을 걷기 시작한 때문에 이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채 조용히 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