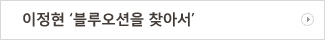- 몇 해 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장애인 교육여건 개선 결의대회 모습이다. 사진=조선DB
교육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총 29조259억원을 투입해 노후 학교시설을 고치는 등의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낭비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장애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부족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원성이 나온다.
“특수학교가 부족해 학령기에 입학도 못하는 장애인이 수두룩하고 가까운 곳에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없어 한두 시간씩 통학하는 장애인과 부모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월 3일 국회에서 장애인 교육권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교육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김민석 김예지 양정숙 이원욱 강득구 의원)이 마련했다.
현재 학력인구는 감소추세지만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2018년 9만780명에서 2023년 10만9703명으로 약 21% 증가했다. 2022년 4월 기준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은 약 1.8%다. 2013년 1.2%임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영유아 단계의 특수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들어간 장애 영아는 9584명에 이른다. 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입학한 장애아가 6170명, 통합 어린이집에 입학한 장애아는 6143명 등이다.
어린이집에서 보육받고 있는 장애 유아가 공사립 유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유아에 비해 1.5배 이상 많음에도 특수교사 배치는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각종 선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장애 영유아들이 놀이할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율이 매우 부족하다.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터다. 전국의 놀이시설 7만9584개 중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30여 곳이며 이는 전체 어린이 놀이시설의 0.04%에 불과하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장애가 있는 어린이는 배제되어 있다.
<표> 한국, 미국, 독일, 일본의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
|
구분 |
한국 (2023) |
미국 (2021~2022) |
독일 (2019~2020) |
일본 (2020) |
|
전체 유초중고(명) |
5,783,612 |
54,739,000 |
약 10,800,000 |
9,585,714 |
|
특수교육 대상자(명) |
109,703 |
7,259,000 |
571,671 |
581,500 |
|
특수교육 대상자의 비율(%) |
1.76 |
13.26 |
5.2 |
6.06 |
전국 11개 국립대 기준, 올해 장애대학생 31명이 자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0여명 수준이었던 자퇴학생은 코로나19로 대학 수업이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된 이후 2021년 30건, 2022년 36건, 2023년(9월 기준) 31명으로 늘었다.
자퇴 이유는 다양하나 재난이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슬픈 현실이 교육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수교사도 부족하다. 2023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사 법정정원(4명 당 1명)은 2만7426명이어야 하지만 현행 교사는 2만3462명으로 85.5%다. 약 4000여명이 더 필요하다.
교육부에서 2024년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 바료에 따르면 내년 68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수교사 법정정원에 대해 전남은 106.5%로 가장 높고 부산이 61.9%로 가장 낮다. 지역별 편차가 크다.
<표> 전국 시도 특수교사 법정정원

2023명 특수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2022년 1만4466명에서 2023년 1만5785명으로 1319명이 증가했다.
지역별 편차가 있는데 2023년 특수교육 지원인력 1인당 지원 학생수는 경기도가 10.1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 9.7명, 부산 8.8명에 이른다. 여기에 유급지원 인력은 61%에서 59%로 감소한 반면 무급지원 인력은 7%에서 11%로 늘었다. 무급지원 인력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애교육 책임을 장애학생 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4명 당 1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토록하는데, 법정 정원 기준은 없지만 특수교사와 동일하게 4명 당 1명의 지원인력도 필요하다고 볼 때 1만20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김효송 중등특수교사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 예산비율은 3.8%로 3조2373억원이나 미국은 전체 교육예산 중 21%(14조8600억원)를 특수교육 운영에 지출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우리나라 특수교육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