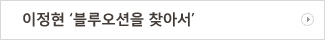-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작년 11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결심공판이 25일 열렸다. 이 사건은 2016년 특검법 발의로 기소가 이뤄진 후 약 7년간 결론이 나지 않았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이 지난 2020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박영수특검의 활동이 여러 이유로 중지되고 임명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임 특검을 지명하지 않아 해당 사건은 3년여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7인(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교육문화체육비서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7인은 최후진술에서 "7년간의 재판으로 사회적으로 사실상 매장되다시피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 등 특검팀이 1심에서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2017년 7월 1심은 당시 김 전 실장 등 인사들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고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요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문화 표현과 활동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1월 2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조 전 실장 역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1월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일부무죄 취지로 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해당 사건이 과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에 의한 사건이며, 범죄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본건의 수사기록에 박영수특검이 작성한 범죄인지서가 없다는 점 ▲특검법이 최순실 관련사건과 그들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본건은 최순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수사착수 초기부터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논의가 분분했고 국조특위에서도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발언이 나왔다는 점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법적 종료(2017.1.12)된 후 특위 위원들이 본인을 고발했다는 점 ▲국가공무원법상 1급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만큼 1급 사표를 받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점 ▲ 미결구금일수가 2년 8개월이 넘고 피고인이 고령의 중환자인 점 ▲문체부 블랙리스트를 대통령비서실장부터 문체부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들이 공모했다면서 보조금 지급을 실행한 유진룡 문체부장관과 직원들은 입건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은 "박영수특검의 행태는 기소편의주의의 한계를 넘은 공소권의 남용이며, 피고인들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사심없이 직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이며 그의 고등학교-대학교 선배인 김문희 변호사도 법정에서 "평생 국가를 위해 일한 김 전 실장이 어떻게 이런 일에 말려들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이것은 자기의 잘못에 의한 범죄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양극 투쟁과정에서 일어난 일 아닌가. 지금처럼 서로 싸우는게 옳겠느냐"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해당 사건 선고공판은 12월 초 열릴 예정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