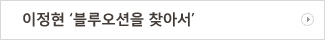◉ "1980년대 초부터 토플러 읽었기 때문에 과거의 민주화 운동권이나 진보세력과는 다른 길 걷게 됐다"

- 장기표 선생은 말년에 특권폐지국민운동을 벌였다. 사진=조선DB
“난 그렇게 살고자 해요. 대학 시절 데모를 하면 교수님들이 만류하면서 ‘야, 너도 어른이 돼 봐라. 우리 심정 이해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때 결심했죠. ‘난 나이가 들어도 후배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는 않겠다’고 말입니다. ‘나이 먹었다고 현실과 타협하는 삶은 안 살겠다’는 생각이 비교적 강한 편이었죠.”
2009년 9월 ‘수도분할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던 장기표 선생을 만나 인터뷰했을 때(《월간조선》11월호 게재), 기자가 ‘마지막 재야’ 라는 그의 별명에 대해 묻자 “그게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내 삶이 그런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가 했던 말이다.
오십대 후반에 접어든 기자는 이제 안다. 그렇게 사는 게 정말 힘들다는 것을....장기표 선생의 생각에 동의하건 않건 그가 ‘나이 먹었다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 장기표 선생이 9월 22일 타계했다. 향년 78세.
《한겨레》는 그의 부고 기사에 ‘노무현-문재인과 앙숙’이었다는 것을 굳이 명시했다. 《한겨레》기사는 그게 장 선생은 ‘재야의 주류’였고, 노-문은 '재야의 변방'이었기 때문이라는 뉘앙스를 풍겼지만, 꼭 그래서는 아니었을 게다. 그보다는 “나이 먹었다고 현실과 타협하는 삶은 안 살겠다”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온 장 선생이 보기에는 노무현-문재인 무리가 하는 짓들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고, 그걸 그냥 보아 넘기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장 선생이 노무현을 “허구(虛構)와 정략(政略)에 기대 스타가 된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장기표 선생은 문재인에 대해서는 더 비판적이었다. 그는 《월간조선》 2020년 12월호 인터뷰에서는 1984년 민통련을 만들기 위해 부산에 내려갔을 때 당시 변호사이던 문재인이 한 마디로 민통련 참여를 거절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문 대통령은 운동권에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다. 그는 학생 데모를 잠깐 했을 뿐이지,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인터뷰에서 장 선생은 문재인 정권을 ‘전체주의 독재’로 규정했다.
“군사 독재는 눈에 보여요. 과제와 대상이 분명합니다. 전체주의 독재는 대중매체를 통해 여론을 조작·통제해서 국민 다수에게 같은 이데올로기를 심는 겁니다. 요즘 KBS 보세요. 매일 저녁 9시 뉴스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교묘하게 세뇌를 시키지 않습니까.”
장기표 선생과 함께 1980년대 ‘재야 3인방’으로 이름을 떨쳤던 이부영이나 김근태는 김대중 정권 이후 국회의원, 여당 대표, 장관 등으로 잘 나갔지만, 장 선생은 그 시절에도 ‘재야’였다. 그에게도 정계 진출의 꿈은 있었고, 몇 번 여야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도 했지만 번번히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에게는 ‘슬픈 소극(笑劇)’이었다.
장기표 선생은 교사였던 부인이 일을 그만 둔 후에는 국민연금 17만원과 관악구에 있는 25평짜리 아파트를 역모기지해서 받는 95만원으로 말년의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10억원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받기를 거부했다. 《월간조선》 2020년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받아도 되는 것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애당초 독재 정권 아래서는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투쟁을 해놓고 뒤늦게 합법성을 인정받는 건 자가당착입니다. ....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는요, 그 사람이 노동운동을 했건, 실업자건, 농민이건, 똑같이 해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독립운동 하고 노동운동 했다고 더 잘 먹고 잘살면 되겠어요?”
정치적 실패를 거듭했지만 장기표 선생은 자신을 ‘정치인’으로 생각했다. 《월간조선》 2020년 12월호 인터뷰에서 그는 ‘정치문화재’를 자처하면서 “저는 정치밖에 모르고 죽을 때까지 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대한민국의 나아갈 바를 모색해 보겠다며 신문명정책연구원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고, 말년에는 국회의원 특권폐지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2008년 기자와 인터뷰 했을 때, 장 선생은 자신이 ‘신문명정책운동’을 벌인 것은 1980년대 초부터 앨빈 토플러의 책들을 읽었던 덕분이라고 말했다.
"내가 골수 운동권 아닙니까. 하지만 그쪽 책들은 재미없어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두 페이지만 보면 계속 똑같은 내용 나오는데, 그걸 뭐 하러 읽어요. 성경책은 재미라도 있지. 운동권의 유물론은 ‘관념적 유물론’이고, 그들의 변증법은 ‘정태적(靜態的) 변증법’입니다. 하부구조가 바뀌면 상부구조도 바뀐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인데, 그들은 하부구조가 바뀌었는데도 생각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변하는 게 변증법인데, 그들의 변증법은 ‘변하지 않는 변증법’이에요.”
그러면서 장 선생은 “그 시절 토플러를 읽었기 때문에 나는 과거의 민주화 운동권이나 진보세력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됐다”면서 “이런 문명사적 전환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해법을 나는 갖고 있다”고 호언했다.
세속적 기준으로 보면 장기표 선생은 이것저것 부산하게 일만 벌이다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나이 먹었다고 현실과 타협하는 삶은 안 살겠다’고 했던 젊은날의 다짐은 지켰다. 장 선생은 지난 7월 SNS를 통해 자신의 암 발병 사실을 알리면서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으며, 또 이룰 만큼 이루었으니 아무 미련 없이 보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한다”고 말했다. 아마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하며 살았다는 자부심에서 한 말이리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