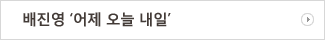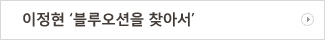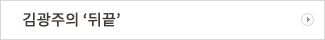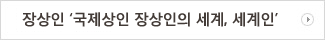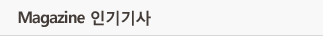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 신생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싸웠던 젊은이들은 홀로코스트를 겪고 이스라엘로 이주해온 유럽 유대인들을 ‘비누’라고 비웃었다. 나치가 아우슈비츠 같은 절멸(絶滅)수용소에서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사체(死體)에서 기름을 짜내 비누를 만들었다는 속설에서 나온 비아냥이었다. 그들에게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은 ‘양처럼 순순하게 도살장으로 끌려간’ 무기력한 존재였다. 투쟁적이고 역동적인 새 이스라엘 국가는 그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었다.
‘유대인 여성 레지스탕스 투쟁기’라는 부제(副題)가 붙은 이 책은 ‘양처럼 순순하게’ 죽기를 거부했던 나치 하 폴란드 게토(유대인 격리구역)의 유대인들, 특히 젊은(어린) 여성들에 대한 얘기다. 그들은 폴란드가 패망하고 나치가 유대인들을 옥죄기 시작할 때부터 게토 내에 학교와 도서관을 만들어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외부 소식을 전하고, 게토 내에서 필요한 식품과 물자들을 밀수했다. 나치가 분할해 놓은 폴란드 점령지의 경계선들을 넘나들면서 외국에 있는 유대인 조직들이 마련한 자금을 들여와서 도망 다니는 유대인들을 숨기거나 탈출시키는 일도 했다.
그리고 이들은 나치가 바르샤바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게토에서 유대인들을 아유슈비츠 같은 절멸수용소로 완전 추방할 즈음에는 독일군으로부터 훔치거나 폴란드 레지스탕스로부터 얻은 무기들, 화염병 같은 사제(私製) 무기들을 가지고 무장봉기를 했다. 유대인들을 탄압과 학살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나약한 존재로 여겼던 나치는 이들의 봉기에 당황했고, 그만큼 더 잔인하게 진압했다. 일부 여성은 대담하게 나치 게슈타포 간부들을 암살하기도 했다. ‘우리는 양처럼 학살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 이들의 슬로건이었다.
이들 중 운좋게 살아남은 이들은 나중에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새로운 유대인 국가 건설에 참여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전쟁의 화염과 게슈타포의 고문을 이겨냈던 투사들 가운데는 그런 삶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도 있었다.
이 글 맨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국가 정체성(正體性)을 만들어나가야 했던 건국 초기 이스라엘의 정치적 환경은 그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스라엘의 정치권과 시민들은 ‘양처럼 순순히 도살장으로 끌려가기를 거부’했던 이들의 투쟁 서사(敍事)에는 관심을 기울였지만, 홀로코스트로 가족을 잃고, 투쟁 과정에서 동지를 잃고, 게슈타포에게 야만적인 고문을 받으면서 심신이 망가졌던 이들의 고통은 외면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초기 네이션 빌딩(nation building) 과정이 마무리되는 1960년대 이후에는 유대인들의 희생을 강조하는 ‘홀로코스트 서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들 투사들의 이야기는 잊혔다.
이들은 자신의 고향이자 활동 무대였던 폴란드에서도 잊힌 존재가 되었다. 냉전(冷戰) 시절 공산 정권 치하에서 ‘시오니즘’은 금기어(禁忌語)였고, 유대인들의 투쟁사 또한 ‘위험한 기억’이었다. 공산정권이 무너진 후에는 새로운 폴란드 민족주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과거 폴란드에서 창궐했던 반(反)유대주의가 부활하기 시작했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피해자’였다는 것을 강조해야 했던 우익 정권은 국내군(國內軍‧ 영국에 있던 폴란드 망명정부를 지지했던 우익성향 레지스탕스 조직)에 대한 기억은 열심히 되살리면서도 나치 하에서 유대인 학살을 방조(傍助)하거나 그에 협조했던 (일부) 폴란드인들의 흑역사(黑歷史)는 덮었다. 폴란드 정부는 ‘홀로코스트 관련 범죄로 폴란드를 비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까지 통과시켰다. 이를 어기면 투옥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5‧18 특별법이 4‧3특별법과 닮은 꼴이다. 저자는 말한다.
“역사적 내러티브가 무엇을 말해도 괜찮은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골치 아픈 일이다. 법은 진실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 효과에 관심이 있는 권력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기억’, 즉 역사는, 국가는, 민족은, 대중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을 것을 강요당하는가에 대한 책이다. 과거사를 둘러싼 역사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에게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 책은 전쟁, 게토에서의 격리, 학살, 고문, 배신, 도주, 처형, 죽음, 이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감추어야 하는 데서 오는 영혼의 고통 등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 순간들을 견디어내야 했던 이들에게는 “매 순간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생존해 있는 하루하루가 순전히 행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분위기는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 10대 후반, 20대 초중반 여성들이 주인공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왠지 모를 낙관과 긍정의 에너지가 느껴진다. 여성 레지스탕스 차이카 그로스만은 “그들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어떤 경계선도 그들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었다”고 말한다. 히르시 글릭이 빌나 게토에서 이디시어로 쓴 ‘파르티잔의 노래’에도 그런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