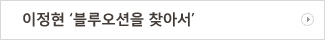- 바로셀로나에 있는 성 가정 성당. 수 많은 관광객들이 바로셀로나에 들러 이 성당을 찾는다.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i·1852~1926년)가 26세에 바르셀로나 건축학교를 졸업할 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오늘 우리는 미친 놈 아니면 천재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시간이 지나면 그 해답을 알 것이다.”
그 해답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가우디는 1926년 세상을 떠났다. 꼭 100년 뒤인 2026년, 앞으로 2년 뒤 완공될 예정인 사그라다 파밀리아(Sagrada Familia) 성당, 즉 성(聖)가정성당이 완성되면 그 해답의 진위(眞僞)가 증명될 것이다.
가우디가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짓기 시작한 것은 31세 무렵. 원래 스승인 비야르(Francisco de Paula del Villar)가 설계와 건축을 맡았으나 1년 만에 가우디로 교체되었다.
평생 독신으로 산 그는 1883년부터 사망한 1926년 6월까지 40여 년간 모든 것을 쏟아냈다. 르네상스 시대의 미켈란젤로처럼 말이다. 그의 시신은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지하경당에 누워 있다. 사람의 영(靈)이 있다면 그는 잠들지 않고 밤이면 깨어나 성당 곳곳을 누비거나 건축가의 마음에 간섭하며 이렇게 외칠 것만 같다.
“신은 곡선을 만들고 인간은 직선을 만들었다. 직선은 곡선을 이길 수 없다. 더 굽히고 더 누이고 더 낮춰라. 다 내어줘라.”
많은 사람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사진을 찍었다. 찍는 마음은 한결같으리라. 성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어떤 젊은 남녀가 두 손을 꼭 잡고 셀카를 찍었다. 두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가우디의 계획에 따라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3개의 파사드로 나눠져 있었다. 스페인어 파사드(facade), 영어 프런트(front)는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있는 정면부(正面部)라는 뜻이다.
탄생의 파사드, 수난의 파사드, 영광의 파사드 등 각 파사드는 예수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최후의 심판을 상징한다. 묵주기도의 3가지 신비인 ‘환희의 신비’와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가 나타내는 의미와도 관련이 깊다.

성가정 성당 벽면에 새겨진 헤롯 왕의 병사들이 아이들을 죽이는 조각상이다.

예수가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천상모후의 관을 씌우는 조각상이다.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가 헤롯 왕의 병사들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하는 조각상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숨지는 장면(위)과 베로니카(형장으로 가는 예수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준 성녀)가 예수의 얼굴이 ‘찍힌’ 수건을 드는 장면의 조각상이다.

‘생명의 나무(Tree of Life)’ 조각상이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가 생명의 나무가 되었다’고 적고 있다.
가우디의 손으로 완성된 탄생의 파사드를 보았다. 성당 정면에 옥수수를 닮은 4개의 첨탑이 우뚝 서 있었다. 첨탑은 4명의 사도(使徒) 마태오(기독교에선 마태), 마르코(마가), 루카(누가), 요한 등 신약(新約)의 복음사서(四書) 저자들을 상징해 만들어졌다.
탄생의 파사드에는 예수가 태어나는 장면, 목동들이 경배를 드리는 장면, 헤롯 왕의 병사들이 아이들을 죽이는 장면, 성가정(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이 헤롯 왕의 병사들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가는 장면, 마리아가 천상모후의 관을 쓰는 장면, 생명의 나무 등이 조각돼 있었다.
또 다른 수난의 파사드는 호세프 마리아 수비라치(Josep Maria Subirachs)에 의해 1976년 완공됐다. 딱 26년이 걸렸다. 최후의 만찬, 유다의 입맞춤, 에케 호모(Ecce Homo·로마 총독 빌라도가 가시 면류관을 쓴 예수를 가리키며 군중에게 외친 말로 ‘이 사람을 보라’라는 뜻이다), 베로니카(형장으로 가는 예수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준 성녀)가 예수의 얼굴이 ‘찍힌’ 수건을 드는 장면, 예수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십자가에 매달린 참혹한 장면이 형상화되어 있었다.
성당 안으로 들어섰다. 성당이 완공되면 1만3000명이 한꺼번에 미사를 볼 수 있는 크기였다. 중앙 제대(祭臺) 앞 신자석인 장의자에 앉았다. 다양한 색채의 스테인드글라스 물결이 성당 내부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초록에서 파랑, 파랑에서 빨강, 빨강에서 다시 노랑으로 바뀌는 장엄한 빛의 축제였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벽에 400여개 언어로 쓰인 주기도문이 적혀 있었다. 가운데 한글로 새겨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문구가 보였다. 조금 의아했다. 한국 천주교의 ‘주님의 기도’에 저 문장을 쓰지 않는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로 쓴다. 종결어미를 써서 '주옵소서'라고 했을 테지만 '필요'라는 단어는 쓴 적이 없다. 또 '우리' '저희'로 오래 전에 바뀌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이자 순교성인 김대건(金大建·1822~1846년) 신부를 뜻하는 ‘A·KIM’이란 영문 글씨가 적힌 스테인드글라스도 보였다. ‘A’는 김대건 신부의 세례명인 안드레아를 뜻한다.
영광의 파사드가 완공되기까지 2년이 남았다. 그때 다시 올 수 있을까. 기약 없는 바람을 품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