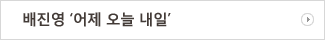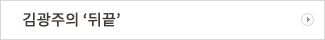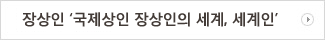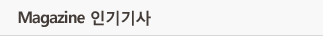-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의 모습이다.
해 지는 서녘을 배경위로 우뚝 선 스페인 왕궁은 아름다웠다. 왕궁 앞 가로등이 켜지고 사람들은 어딘가로 바삐 향하고 있었다.
이 왕궁은 원래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전이 있었으나 1734년 크리스마스 날 밤에 불타 버렸다고 한다. 그후 프랑스 루이 14세의 손자인 펠리페 5세가 그 자리에 베르사유 궁전을 닮은 궁전을 지을 것을 명한다.
눈부신 햇살을 받으면 더욱 빛나는 궁전 양식으로 건축했다. 이탈리아 건축가가 지었는데 2800개나 되는 방이 있단다.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을 본떠서 만든 옥좌의 방(Salon del Trono), 로코코 양식의 걸작품으로 채워진 정교함과 화려함의 극치인 가스파리니의 방(Salon del Gasparini), 145명이 앉아 식사할 수 있는 대형 식탁이 있는 연회장도 있다고 한다.

‘용맹왕’으로 불린 알폰소 6세(Alfonso VI)
마드리드를 배경으로 몇 가지 전설이 내려오는데 8세기 이후 이슬람 왕국이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기 시작해 9세기 경에는 스페인 반도의 중요한 지역까지 차지한다.
술탄 모하메드 1세 때인 873년 아랍인들은 현재의 왕궁이 있는 언덕에 톨레도(옛 수도)를 수비하기 위한 요새를 만들었고 그 이름을 ‘물의 원천’이란 뜻의 마헤리트(Mayrit)라 불렀고 마드리드(Madrid)의 기원이 되었다. 아랍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 교인들을 포함해 1500명 정도가 사는 자그마한 소도시였다.
중세 스페인 역사에 ‘용맹왕’으로 불린 알폰소 6세(Alfonso VI)가 1083년 마드리드를 탈환했으나 14세까지 마드리드는 까스띠야 레온(Castilla y León) 왕국의 작은 도시에 불과했다. 1492년 가톨릭 국왕부처(Los Reyes Católicos)에 의해 이슬람 왕국의 마지막 본거지였던 그라나다(Granada)가 함락되었다. 같은 해 신대륙으로 가는 항로가 개척되면서 스페인은 황금세기(Siglo del Oro)라 불리는 전성기를 맞게 된다. 1556년 왕으로 등극한 펠리페 2세는 당시 수도였던 톨레도가 대제국의 수도로 부적당하다고 판단, 1561년 마드리드로 천도(遷都)했다. 이후 마드리드는 명실상부한 스페인의 중심 도시가 되었다.
스페인의 왕위계승 전쟁(1701~1714년) 당시 마드리드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 대신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를 지지했는데 부르봉 왕가의 집권 이후 마드리드는 더욱 번창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알무데나 대성당. 대성당 벽면에 돋을새김 조각상. 이 대성당은 기적 같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마드리드 왕궁 옆 알무데나 대성당이 보였는데, 성당 건물이기보다 또다른 왕궁 같았다. 인상적이게도 성당 벽면에 커다른 돋을새김 성모상이 보였다. 멀리서 한참을 뚫어지게 바라 보았다. 저 대성당에 기막힌 사연이 있다고 한다.
8세기경 마드리드가 이슬람 세력에게 점령당했을 때 성모상이 파괴되는 게 두려워 성모상을 알무데나 성벽 속에 숨겨두었다. 그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성상은 잊혀졌다. 370년이 지난 뒤 마드리드를 수복한 알폰소 6세 행렬이 지나갈 때 갑자기 성벽이 무너졌고 숨겨졌던 성모상이 그제야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알무데나 대성당은 바로 이 성모님을 모시면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스페인의 중심이자 마드리드의 심장부로 알려진 마요르 광장(Plaza Mayor de Madrid).

푸에르타 델 솔(Puerta del Sol) 광장.

푸에르타 델 솔 광장의 주변 상가들. 주말이 아닌 데도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푸에르타 델 솔(Puerta del Sol) 광장 주변을 오갔다. ‘태양의 문’이라는 뜻을 지닌 광장이었다.
인종 박람회장이랄 정도로 많은 이들이 광장 주변을 오갔다. 광장을 중심으로 옷가게, 신발가게, 기념품점, 고급 식당, 선술집, 여관, 커피숍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물가가 생각보다 비쌌다. 일행 중 한 명이 여성 속옷을 산다고 해서 들어갔다. 속옷집 1층 쇼 윈도우에 서서 거리를 바라 보았다. 사는 방식은 서울이나 마드리드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속옷이 울긋불긋했다.
광장 한쪽에 마드리드의 상징인 곰과 마드로뇨 나무 동상이 서 있고 중앙에는 도시 발전을 이끌었다는 카를로스 3세의 동상이 서 있었다. 솔 광장의 종탑 건물 정문과 찻길 사이의 인도에 0km라는 표시가 바닥에 그려져 있었다. 이곳이 스페인의 핵심(核心), 한가운데 꼭짓점이란 의미다. 서울로 치면 광화문 세종로파출소 옆 도로원표에 해당한다.
서울에서 마드리드까지 거리가 얼마일까. (서울로 돌아가 도로원표를 찾아갔다. 서울~마드리드는 1만2km, 서울~리스본은 1만423km, 서울~런던은 8871km, 서울~베를린 8872km, 서울~로마는 8974km, 서울~아테나는 8522km, 서울~예루살렘은 8084km였다. )
도시는 솔 광장을 중심으로 마치 태양의 햇살처럼 9개의 길이 방사선형으로 퍼져 있었다.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채 사람들에게 휩싸여 어딘가로 걸아갔다. 광장을 둘러싼 건물은 평범한 공동주택이었다. 매주 일요일마다 벼룩시장이 서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시장이 열린다고 한다. 원룸 같은 작은 방에서 나와 사람들이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겨울이지만 춥지 않았다. 노상 카페에 앉아 상그리아 와인 한 잔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스페인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상그리아는 레드 와인에다 다양한 과일, 탄산수, 설탕을 넣고 하루 정도 숙성시킨 후 얼음과 같이 넣어 마시는 술을 말한다. 칵테일 느낌의 술인데 달작지근하고 맛있었다. 와인과는 또 다른 맛이었다. 금방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취해 버렸다. 여성들이 좋아할 만 한 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그리아 와인
잠시 재래시장인 산 미겔 시장에 들러 현지인이 맥주나 화이트 와인 잔을 앞에 두고 하몽이나 치즈 같은 것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껍질 그대로 생굴을 레몬과 함께 팔기도 했다. 꼬지 같은 걸로 굴을 먹는데 한국이랑 식습관이 비슷하다고 느꼈다. 시장이 떠나가듯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대개 20~30대 젊은이들이었다.

어느 선술집에 내걸린 돼지 뒷다리로 만든 하몽.
하몽이라는 일종의 베이컨 비슷한 소시지를 주문해 먹어 보았다. 짭짤했다. 술 안주로 딱이었다. 하몽은 돼지 뒷다리를 통째로 걸어 놓고 적당량을 잘라 먹는 스페인 고유 음식. 책에서 찾아본 하몽 만드는 방법은 이렇다. 먼저 도살한 돼지의 다리를 잘라 소금에 며칠간 절여놓는다. 그 다음 소금을 제거했다가 다시 절이기를 두세 번 반복한다. 그 사이에 돼지 다리에 세균이 제거되고 염분이 가미되어 상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마지막으로 소금에서 빼내어 깨끗이 씻은 다음 수개월에서 2년 정도 걸어 놓는데 일반적으로 집 천장이나 지하실 등 신선한 곳, 특히 굴이나 저장 창고에 걸어 두는 경우도 있다. 하몽을 만들기에 적당한 시기는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11월 초순경이란다. 스페인 겨울을 한국식 겨울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마드리드 겨울은, 잠시 잠깐 스쳐 지나는 느낌으로 한국의 늦가을 정도 기온이다. [2월 9일 새벽 4시(한국시각 낮 12시) 현재 마드리드 기온은 9도다. 체감온도는 3도다.]
선술집이나 식당 어디를 가나 하몽이 나왔는데 보카디요(샌드위치)를 먹거나 술을 마실 때 곁들여 먹는다. 호텔의 등급을 매기듯, 하몽은 등급에 따라 J(호타)표 하나에서 다섯 개까지 표기한다. 한국식으로 치면 별이 다섯 개! 걸어놓은 돼지 다리의 발톱이 시커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