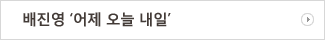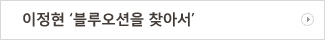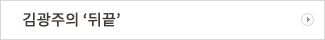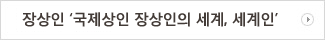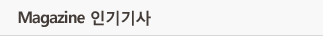- 스페인 내전의 참상을 그린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1937). 스페인 내전 당시 북부 도시 게르니카가 나치의 폭격으로 파괴되면서 고통받는 인간과 동물의 모습이 담겨 있다.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서 나와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으로 갔다. 이 미술관에서 20세기 다양한 현대 미술을 접할 수 있었다. 프라도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다. 18세기 종합병원이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미술관으로 1986년 개관했다고 한다.
많은 작품 중에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의 <게르니카(Guernica)>(1937)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무엇보다 그림 크기에 압도당했다. 349cm x 777cm의 대작.
그 큰 그림 앞에 수많은 사람이 서 있었다. 사람들이 빠져 나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몰려와 그 앞을 점령했다.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고, 보고 또 보고, 또또 보는 것이었다.




피카소의 <게르니카> 앞에 몰려든 관람객들.
기자도 관람객들을 따라 그림 옆과 앞, 멀리서 보고 곁눈질로도 보았다. 또 또 보았다.
게르니카의 비극은 1936년 스페인 정치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그해 2월 좌파정권이 탄생하자 우파 반란군인 프랑코 장군이 모로코에 주둔하던 부대를 이끌고 스페인 주요 도시를 점령했다. 파시즘 정권인 독일과 이탈리아도 프랑코 군부를 도왔다. 소련은 좌파 정부군을 지원했다.
내전이 한창이던 1937년 4월 26일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작은 마을 게르니카에서 독일 콘도르 군단 폭격기가 무차별 양민을 학살했다. 이 폭격의 주된 임무는 무기 성능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었다. 그날은 장날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있었다고 한다.
1937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출품 작품을 구상 중이던 피카소는 독일군 만행의 비보를 접하고 조국 스페인의 암울한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이 그림을 그렸다.
그림에는 거대한 폭격기도 사람을 죽은 폭탄도 보이지 않았다. 절규하듯 입을 벌린 사람, 부러진 칼을 쥔 손, 전등을 쥔 손, 소리치는 말, 눈동자와 같은 백색 전구, 퀭한 황소의 눈(황소는 ‘투우의 나라’ 스페인을 의미한다. 황소에게서 불이 뿜어져 나올 것만 같았다.), 입을 다문 죽은 아이의 자그마한 손과 발, 아이를 안고 절규하는 어머니, 죽은 군인, 나동그라진 말 등을 회색과 검정색만으로 채색했다. 암담한 분위기, 무의식 속 혼돈이 느껴졌다. 그림 속 사람과 동물의 ‘눈’과 ‘귀’가 오랜 여운을 주었다.
고야의 사실적인 작품 <1808년 5월 3일>과 달라도 함참 달랐다. 모더니즘의 뚜렷한 상징성을 띄는데 비극을 초월하는 차원이 다른 비극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프랑코는 집권 내내 이 작품을 전시할 수가 없었고 민주화가 이뤄진 뒤에도 한동안 외부인 관람이 제안됐다. 게르니카는 스페인이 민주화됐을 때 돌려받기로 하고 1939년 뉴욕박물관에 기증했다. 1981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고 한다.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1904~1989)의 초기작 <창가의 소녀>(1925)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1904~1989)의 초기작 <창가의 소녀>(1925)를 보았다. 달리가 약관의 나이 때 그린 작품이다. (기념품 숍에 가니 이 그림으로 가방을 인쇄해 팔고 있었다.)
초현실주의 느낌은 없는 창문 밖을 바라보는 소녀의 그림이었다. 그런데 자꾸 그림을 보고 있으니 창문 밖에는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있을 것만 같았다. 강물(호수) 속으로 소녀가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그러고 보니 소녀는 창문 밖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문득, 달리가 초현실주의에 빠져든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다. 저 그림이 새로운 차원으로 향하는 블랙홀처럼 느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