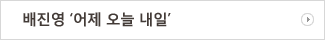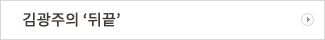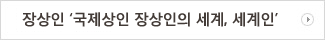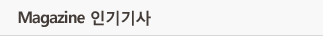- 유럽의 대표 순레지로 꼽히는 몽생미셸 수도원. 몽은 산(山), 생은 세인트(聖), 미셸은 미카엘 대천사를 뜻한다.
유럽의 대표 순례지인 몽생미셸 수도원(Le Mont-Saint-Michel)을 보았다. 바다 위에 솟은 수도원. 바다의 반석 위에 세운 서구의 경이(驚異). 709년에 세워졌다. 대천사 미카엘의 이름을 땄다.

프랑스 노르망디에 위치한 몽생미셸 수도원.
군사 요새(要塞), 혹은 형무소와 같은 닫힌 공간. 외로운 고딕 첨탑. 금언과 침묵의 공간. 멀리 바다 물새 소리만 들렸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으나 하늘은 맑았다. 전투기가 흰 선을 그으며 하늘을 가로 질러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향하는 것일까.
두건을 쓴 수도사가 거닐었던 수도원 산책로를 걸었다. 그들이 걸어 다녔던 돌계단을 올랐다. 돌계단과 수도원 성채가 세월의 흔적으로 윤기가 나고 반들반들했다.
매일 매일 수도사들은 신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을까. 얼마나 소리 높여 찬미의 노래를 불렀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때로 불행하다고 느꼈을까. 기도 하나로 생목숨을 꺾을 결심을 했을까. 이곳에서 인생의 고비를 예고 없이 겪었을까. 새벽미사를 드릴 때 몸이 심장이 저 머릿속이 떨려왔을까. 강렬하고 신들린 파토스로 결국 미쳐버렸을까.
그리고 수도사들 중에 한때 굴뚝 청소부가 있었을까. 수도원에서 굴뚝 청소를 기꺼이 했을까.



칼을 든 미카엘 대천사의 모습이다. 몽생미셸의 고딕 첨탑 끝에 서서 수도원을 수호하고 있다.
수도사가 죽으면 사흘 간 장례미사를 한 후 주검을 수도원 내에 두었다고 한다. 주검을 두었던 공간 앞에 피에타상이 있었다. 몸속에서 죽음이 빠져 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수도사들은 주검을 땅에 매장하지 않았다. 그대로 방치해 시체 썩는 냄새가 수도원을 진동을 하게 만들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지 않으려는 간절함이었다. 수도사들은 그 지독한 냄새로 편두통을 달고 살았으리라. 소름이 쫙 돋는 듯했다.

해질 무렵 몽생미셸.
어둑한 밤이 되어서야 몽생미셸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이미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