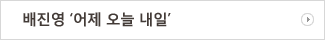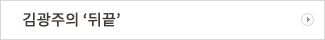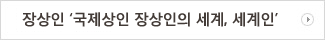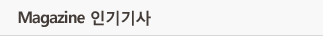시인이자 1세대 영화평론가, 영화사연구자로 살아온 김종원 선생이 세 번째 시집을 펴냈다. 《강냉이 사설》(1970), 《광화문행》(1988)에 이어 무려 35년만이다.
시집 《시네마천국》(한상언영화연구소 刊)은 한평생 영화에 바친 시인의 일생을 헌사하는 듯하다.
I.
뱃고동이 앗아간 망향의 부두도
안개 낀 카사블랑카의 공항도
노를 젓다 만 운하의 노천극장도
불 꺼진 뒤엔 삭막하게 잠기지만
그것은 아주 꺼진 것이 아니다.
새 날을 여는 축복의 불꽃처럼
어둠 속에서 쓸쓸히 지켜본
연인의 창문처럼
그것은 정녕 닫힌 것이 아니다.
귀여운 성당의 염탐꾼 토토야
인생이란 달콤한 영화와는 다르다.
어깨너머 본 사각四角의
세상과는 다르다.
이 나라에선 아픈 과거도
감미로운 오늘의 이야기로 태어난다.
여기에서는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철부지로 남는다.
Ⅱ.
오늘 시칠리 섬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나의 어린 날.
불야성처럼
눈부신
유채꽃 섬 마루.
철조망 들치고 들어간
슬픈 활동사진이여.
-김종원의 시 ‘시네마천국’ 전문

김종원의 시 ‘시네마천국’에는 제주 출신 그가 영화에 바친 삶이 모두 담겨 있다. 쥬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시네마천국>(1990) 속 소년 토토처럼 마을 광장에 있던 낡은 극장으로 달려가던 장면이 오버랩된다. 그리고 자신의 걸어온 길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나라에선 아픈 과거도/ 감미로운 오늘의 이야기로 태어난다./ 여기에서는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철부지로 남는다.’는 4연이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가 경험한 스크린 밖 인생은 '달콤한 영화와는' 달랐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어깨너머 본 사각의/ 세상과는' 달라도 한참 달랐다고 해도 그에게 삶은, 인생은 '아주 꺼진 불꽃'도, '닫힌 연인의 창문'도 아니었다.
일찍이 그는 뜨거운 문청 시절을 보냈다. 제주 출신 1호 등단 시인으로 이름을 날렸다. 중3 때인 1952년에 시를 알게 된 이후 그의 고향 신문인 《제주신문》에 시 ‘비탈길’이 처녀작으로 실렸다.
그해 12월 피난지 대구에서 창간한 중고등학생 잡지 《학원》에 ‘국화는 피어도’가, 그리고 이듬해인 1953년 7월에는 ‘봄’이라는 시가 《소년세계》 제1회 문학상에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은메달을 받았다. 각기 조지훈 시인과 이원수 아동문학가에 의해 뽑힌 것이다. 특히 ‘국화는 피어도’는 조지훈 선생이 언급했듯이 《학원》지가 창간되고 최초로 뽑힌 시였다.
공식 문단 데뷔는 대학 2학년과 4학년 1학기 때 월간 《문학예술》과 《사상계》 추천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시인이 된 것이 어느새 예순 네 해가 되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양팔을 벌리고
힘겹게 다리를 뻗고 서 있는
다섯 개의 뿔의 형상을
사방에 한 줄 삼각형으로 그려놓고
왜 하필 별이라 불렀을까.
백 년 전 최초의 공상과학영화
'달나라 여행'을 만든
마술사 출신 조르주 멜리에스도
자신의 회사 이름을
스타필름이라 붙이고
이런 별을 상표로 내세웠지.
그런데 내가 간밤에 꾼 꿈속의 별은
활같이 휘인 온통 금광의 초생달
하지만 아무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수평선에선 돛대부터 떠오르지 않는 곳,
수천 광년의 우주에서는 이 지구도
다섯 뿔 가진 예삿별로 보일까.
-김종원의 시 ‘동화의 별’ 전문
시 ‘겨울 볕 아래서’를 읽는다. 이 시는 페데리코 펠리니의 영화 <길(La Strada)>를 떠올리며 쓴 시일까. 이 영화는 전후(戰後) 시기인 1957년 국내 개봉했다.
그 역시 가난한 시절을 거치며 '볼품없는 돌멩이', '낡은 삼륜차', '지친 어릿광대'의 길을 지나 '한순간 스치는 눈발의 별'일망정 뒤돌아보면 '절로 경탄하게 되는' 삶을 살았다. 시인은 영화평론의 숲에서 ‘아름드리 거목’으로 우뚝섰다. 시인은 자신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한다. '동짓달 눈부신 억겁의 살갗 한 오라기'라고.
몇백억 광년의 별로부터
날아온 빛을 쬐며
한 줌밖에 안 되는
인생 말한다는 게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냐.
소슬바람으로 와서
열한 살 교실 창가에
부끄러운 점심 도시락
가득 채워놓고 달아나던
시골 운동장의 한여름 지열에도
세상의 볼품없는 돌멩이 하나라도
쓸모 있다는 깨우침
가슴 깊이 새기며 돌아간 낡은 삼륜차
그 지친 어릿광대의 어깨 위에
부서지는 검은 햇볕에도
아무 감흥 없이 살아오게 되더니
이제 염치없이 세월만 축내
겨울 한낮 문밖을 나서다가
한순간 스치는 눈발의 볕을 보고도
절로 경탄하게 되는 이 철 늦은 감상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냐.
어릴 적 기워 신던 양말처럼
정겨운 감촉
반나절을 달리는 산행의 차창 틈새로
빠끔히 고개를 디미는
동짓달 눈부신 억겁의 살갗 한 오라기
-김종원의 시 ‘겨울 볕 아래서 - <길>을 회상하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