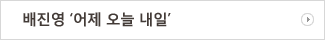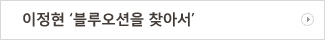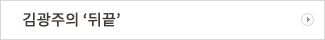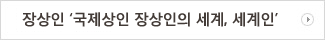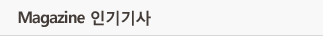- 일러스트=조선DB
박상봉 시인의 시집을 아껴 읽었다.
2년 전 나온 시집 《불탄 나무의 속삭임》(2021)을 읽었던 터라 새로운 시집에 대한 기대가 컸다. 역시나였다.
그러나 이전 시집과 달랐다. 《물속에 두고 온 귀》(모악)는 표현이 사실에서 추상으로 좀 더 나아갔고, 시인의 마음이 슬픔 쪽에 다가서 있다는 게 느껴졌다.
시 <뭉툭한 발>에서 ‘아무도 읽지 않을 시를/ 자갈밭에 맨발로 쓰고 있다’고 했다. 발바닥에다 ‘피내(皮內) 쐐기꼴 문자를 새겼다’고 고백할 정도였다. 얼마나 아팠을까. 삶과 시작(詩作)이 이어져 있었다.
시의 행간에 ‘썰물 들고 밀물 쓸고 가’듯 아쉬운 세월이 묻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겪는 시인의 아픔, 그리움, 늙음 같은 무게에 대해 생각이 많아 보였다. 이전 시집과 달라 보였다. 《불탄 나무의 속삭임》이 손이 많이 탄 세련미가 있다면 이번 시집은 자기만의 묵직한 인생의 손길, 혹은 ‘인생의 신비’(정호승 시인)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 손길, 신비를 생각하니 시 전체에서 슬픔을 이겨내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태어난 걸 후회하지 않아도 되었네’라는 시인의 노랫소리가 독자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것이었다.
물밑바닥까지 가라앉았다가
겨우 구조된 아이는
반 귀머거리가 되어 말도 잊어버리고
바다 깊은 물속에 두고 온 귀는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데
물에 잠긴 귀가 듣는 소리는
아이들 우는 소리만 들린다
-시 <물에 잠긴다는 것> 중에서
계절은 가고 은행나무도 사라지고
허기진 그리움으로 여백만 남은 쟁반이
덩그마니 놓여있는 그날의 식탁
-시 <만두> 중에서
차장 밖에 멀찍이 선 은행나무가
샛노란 단풍잎 후드득 떨어뜨리고 있다
마치, 눈물 떨구는 것 같았다
-시 <은행나무 사다리> 중에서
이별의 먼지 쌓인 툇마루에 쪼그리고 앉아
두 눈동자 밤하늘 별빛 되어 은하수에 닿았다
-시 <꽃마리> 중에서
나는 느닷없이 성장을 멈춘 아이
다락방이 너무 편해 키가 자라지 않았네
키 작은 기관차는 더 이상 기적을 울리지 않네
태어난 걸 후회하지 않아도 되었네
-시 <다락방 알레고리> 중에서

시집 《물속에 두고 온 귀》(모악)
기자는 충실한 독자가 되어 기꺼이 그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 공감하며 시집을 넘겼다. 시 <여름비>와 <일식>, <차마, 부고를>이 긴 여운을 주었다.
빗속에서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고
젖은 발목이 더 젖어 슬프기도 한 여름이다
장마 들면 바지 까내리듯 눈꺼풀 풀어놓고 망연자실 문밖을 내어다 본다
밤이 되면 컹컹 더욱 거세게 짖어대는 빗소리
는개가 밤에 가지런히 발비를 남몰래 벗어놓고 갔다
그런 날, 신발장에서 늦은 오후를 꺼내어 신는다
작달비가 채찍으로 땅을 후려치듯 굵고 세차게 작살을 쏘아댄다
이 산 저 골짜기로 산돌림 돌다가 세상의 집들과 거리의 자동차를
모조리 휩쓸어 버릴 기세다
시가 비보라 친다
자박자박 시의 빗방울 대지를 두드리는 소리 가만 들으며
시가 고인 물웅덩이 잘방질방 발끝으로 걷어차며 걸어도 보고
그렇게 시에 젖다 보면 무엇에 젖는다는 의미를 깨닫게 된다
메마른 가슴이 이런저런 상념에 젖어 들고
뭇배 치듯 급작스레 쏟아지는 모다깃비
여름 콩밭에 심은 열무, 푸른 새잎 돋게 하는 거름비다
-시 <여름비> 전문
쏟아지는 폭우를 보며 시를 썼다. ‘작달비’가 채찍으로 땅을 후려치듯, ‘모다깃비’가 매질하듯 쏟아지고 있다. 시심이 자연과 하나가 된다. 물아일체(物我一體)다. 빗속에 ‘메마른 가슴이 이런저런 상념에 젖어’ 든다. 한바탕 쏟아진 이 비도, 이 슬픔도 ‘여름 콩밭에 심은 열무’거나 ‘푸른 새잎 돋게 하는 거름비’가 되리라 시인은 믿고 있다.
사랑은 기척 없이 왔다
여름은 문 앞에 신 포도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순식간에
지나갔다
달이 태양을 가릴 때 먼 바다로 뛰쳐 도망가 아이를 낳았다
밤새도록 애 우는 소리에 시달리고
어수선한 거리의 소음 피해 방문 꼭 닫고 지내던 일식(日蝕)의 시절이었다
갓난아기한테 먹일 우유 살 돈 얻으려 담요공장 면접 보러 가는 날
무단횡단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법정으로 오랏줄에 엮여 끌려다녔다
빈방에 혼자 남은 아기는
아비 찾아 얼마나 방바닥을 기었는지 온몸에 실꾸리 칭칭
감고 있었다
외진 바닷가 더는 갈 곳 없는 세상 끝에 와서
청춘은 오간 데 없고 길을 잃었으나
살아야 할 이유가 목숨보다 질긴 탯줄 때문이라는 사실 알 게 되었다
아이는 훌쩍 커 애지중지 키운 그 아이와 쏙 빼닮은 아이 둘 키우며 잘 살고 있다
청춘은 일식으로 어둡게 잘려 나갔지만
달이 태양을 다 가려도 아이는 지울 수 없었다
아이는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나를 낳았다
-시 '일식' 전문
감동이 느껴지는 시다. ‘빈방에 남겨진 아이’가 ‘아비 찾아 얼마나 방바닥을 기었는지 온몸에 실꾸리 칭칭 감고 있었다’는 대목에서 감동이 밀려왔다. 그 아이가 자라, ‘그 아이와 쏙 빼닮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니 대견하고 부럽기까지 하다.
‘아이는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나를 낳았다’는 대목이 기억에 남아 자꾸 곱씹게 되었다.
나의 어머니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
어머니를 여의는 일은
세상을 잃는 일이지요
다시 안 돌아올 먼 여행 떠나는
어머니 배웅하는 날
처마 꼬리 붙잡지 못해
차마, 부고 내지 못했습니다
한바탕 긴 꿈을 꾼 것 같아요
막차 놓친 다음
첫 기차가 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한 번만 더 보고 싶은데
눈물 고일 시간도 없이
더 멀어져 가는 먼 길
매화꽃몽우리 톡 터뜨리며
눈밭에 세안(洗眼) 마친 봄이
막, 달려오고 있어요
- 시 '차마, 부고를' 전문
이 시를 읽고서 ‘막차 놓친 다음/ 첫 기차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떠난 어머니를 하염없이 기다린다는 표현이 진심으로 다가왔다. ‘더 멀어져 가는 먼 길’을 뒤로 하고 돌아서니 ‘눈밭에 세안(洗眼) 마친 봄’이 달려온다는 말도 신선하게 다가왔다. 슬픔 속에 희망을 볼 줄 아는 시인의 경륜과 지혜가 느껴졌다.
1958년 경북 청도 출생인 박상봉 시인은 1981년 ‘국시’ 동인으로 문단 활동 시작했다. 1990년 하반기 《오늘의 시》(현암사)에 작품 선정되었고 1995년 《문학정신》 가을호에 시를 발표하면서 문단 활동 재개했다. 시집 《카페 물땡땡》 《불탄 나무의 속삭임》을 펴냈다. 현재 대구시인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