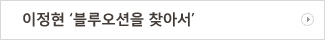-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
박정희의 10·26 서거 이후 신군부 세력에 의한 12·12 쿠데타를 다룬 김성수 감독의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성공한 쿠데타인 12·12를 다룬 국내 첫 영화다.
극(劇) 중 보안사령관 전두광은 실제 인물 전두환을,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은 장태완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전두광은 배우 황정민, 이태신은 배우 정우성이 분(扮)했다.
논란이 많은 정우성을 캐스팅한 김 감독의 의도에 따라 영화 흥행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김 감독의 전작은 영화 <아수라>(2016)다. 또 <내부자들>(2014), <남산의 부장들>(2020)을 만든 제작사 (주)하이브미디어코프가 영화를 만들었다.
▨ ‘전두환 5인방’ 어떻게 그렸을까
무엇보다 김성수 감독이 12·12를 어떻게 바라볼지 흥미로운데 예컨대 당시 전두환의 사람들 - 허화평 합수본부 비서실장, 허삼수 총무국장, 이학봉 수사국장, 장세동 수경사령부 30단장, 김진영 33단장 등 12·12를 이끈 ‘전두환 5인방’을 어떻게 그렸을지 관심이 간다.
▨ 12·12 그날 오후 6시 30분을 어떻게 그렸을까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하기 위해 허삼수, 우경윤, 성환옥 세 대령과 7명의 보안사 수사관이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 모인 시간은 그날 오후 6시 30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 시각, 정승화 총장의 합법적인 연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계엄사 합수부장이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노태우 9사단장, 유학성 군수차관보, 차규헌 수도군단장, 황영시 제1군단장 등 신군부의 주요 장성 9명이 경복궁 내 30 경비단에 모인 것도 같은 시각이었다.
전두환이 마련했으나 자신은 빠지고 대신 보안사 참모장(우국일 준장)이 장태완 수경사령관과 정병주 특전사령관, 김진기 헌병감과 함께 연희동 한정식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도 6시 30분이었다.
이처럼 12월 12일 저녁 6시 30분은 12·12군사쿠데타의 출발점이었다. 영화는 그날 같은 시각,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벌어진 긴박한 현장을 어떻게 그렸을까.

영화 <서울의 봄> 한 장면이다.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의 교전 장면으로 보인다.
▨ 전두환-정승화 어떻게 그렸을까
정승화 계엄사령관에 대한 영화의 시선도 관전 포인트다.
전두환이 정승화를 연행하려 한 것은 10·26 당시 시해현장에 가까이 있었다는 데 대한 ‘일반적 의심’이었다.
5공화국 설계자로 알려진 허화평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정승화는 궁정동에서 40여발의 총성을 듣고도 맨발의 김재규와 함께 김재규의 경호원이 모는 승용차를 타고 육군본부 벙커로 향했다. 정승화는 김재규의 ‘인질’처럼 육본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합수본부의 한 핵심간부는 “우리 속에서 정승화 총장을 김재규와 연루시켜 의심하는 이는 없었다”고 했다.
12·12의 핵심은 전두환이 정승화에 대한 의심(10·26 당시에 취핸 일련의 행동)을 벗겨주지 않고 이를 이용해 반(反) 정승화 세력을 규합하려 했다는데 있다.
12·12를 오래 취재한 조갑제 기자는 다큐 《제5공화국》(월간조선 간)에서 “전두환이 차규헌, 황영시, 유학성 등 선배 장성들을 포섭하고, 12·12사태 뒤에는 명백한 반란행위를 ‘10·26 수사의 연장’이라고 호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정승화에 대한 의심을 조장하고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썼다.
사실 전두환이 정승화를 연행한 배경에는 두 사람 간 갈등도 컸다. 정승화는 12·12가 일어나기 사흘 전 전두환의 잦은 월권을 이유로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전두환 교체를 언급한 적이 있었다.

보안사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된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1980년 1월 19일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을 받으며 걸어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윤성민, 노재현, 이건영, 정승화, 장태완씨 등이 1996년 6월 27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린 12·12와 5·18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전두환-장태완 어떻게 그렸을까
전두환과 장태완의 대결도 영화의 포인트다. 장태완은 정승화 쪽 사람이다. 정승화가 연행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장태완은 놀라움과 분노를 가졌을 수밖에 없었다.
12·12 저녁 연희동 한정식집에서 술을 마시던 장태완(수경사령관)·정병주(특전사령관)·김진기(헌병감)에게 정승화 연행 사실이 전해진 것은 밤 7시 40분쯤이었다. 장태완은 수경사로 귀대했고 정병주는 자택을 거쳐 9시쯤 특전사에 도착했다.
정승화 공관에서 양측의 충돌이 간헐적으로 벌어지고 곳곳에서 군이 출동했다는 소식이 군 상층부에 전해지면서 상황은 일촉즉발로 긴박하게 돌아갔다.
그러나 신군부 측이 전두환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하게 행동한데 반해 진압군은 중심점이 없이 분산된 행동을 보여 결과는 신군부 측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사태파악을 못한 장태완·정병주는 반란군에 체포되었다. 정병주는 자신의 예하 부대원이 쏜 총에 맞아 체포되었다. 그의 비서실장 김오랑 소령은 목숨을 잃었다. 정병주는 이때의 일을 괴로워하다 1989년 3월 한 야산에서 목을 맨 시체로 발견되었다.
‘12·12 사전 계획설’은 전두환이 장태완·정병주·김진기를 연희동 한정식집으로 불러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자신이 마련한 자리에 본인은 가지 않고 보안사 참모장을 대신 보내고, 자신은 최규하 대통령을 만나러 총리 공관에 갔다는 것이다. 정승화 연행을 보고하기 위해서였다. 장태완은 “이 회식 자리에 자신과 정병주·김진기 장군을 불러내 대응할 수 있는 발을 묶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화평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장태완 말대로 그 사람들을 빼돌릴 생각을 했다면 연희동 한정식집이 아니라, 서울 외곽이나 강남 깊숙한 요정에서 회식을 했을 것이다”, “장태완·정병주 등은 당시 통신장비를 갖춘 지휘차량이 있고, 수행원도 있다. 군대를 무력화시키려는 계획이었다면 무전기나 통신장비부터 빼앗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고: 김정형의 《20세기 이야기-1970년대》(답다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