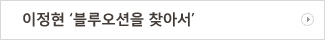- 삿갓 쓰고 지팡이 짚고 괴나리봇짐을 맨 최상락씨. 영월에서 현대판 김삿갓으로 산 지 24년이 흘렀다.
좋은 기운이 모이는 곳
전화기 너머 “김삿갓문학관 건너편 난고정(蘭皐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최상락(63)씨의 말소리에 힘이 가득했다. 말미에는 언제나 “하하하하하” 하고 웃는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5분 정도 걸어 산을 조금 오르니 김삿갓의 시가 적힌 시비와 조형물이 모습을 보인다.
계곡물이 흐르는 다리를 지나자 김삿갓의 호를 딴 난고정이다. 난고정 옆으로 ‘시선난고 김병연지묘(詩仙蘭皐金炳淵之墓)’라 적힌 묘지가 있다. 풍류가객 김삿갓의 묘역이다. 최상락씨는 방금 조선시대에서 건너온 사람처럼 흰 두루마기에 삿갓을 쓰고 사람을 반겼다. “여기 기운이 좋지 않아요? 지금 막 건너온 다리 저쪽 끝은 충북 단양이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여기는 강원도예요. 밑에서 오른쪽으로 3km 정도만 가면 경북 영주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가 모여 있는 삼도접경 지역이죠. 영월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 바로 위 삼도봉이고요. 삼도봉만 있어도 좋다고 하는데 태백산맥이 끝나고 소백산맥이 시작되는 양백지간이기도 합니다. 1.8km 산길을 오르면 제가 살고 있는 김삿갓 주거지가 나오는데 올라가는 길 안에서만 강원도와 충청도가 11번씩 번갈아 바뀝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에서 축지법을 쓸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주거지 쪽은 재난이나 전쟁, 가뭄을 피할 수 있다는 우리나라 십승지(十塍地) 중 한 곳일 만큼 전반적으로 지기(地氣)가 좋은 곳입니다.”
영월에 들어와 현대판 김삿갓으로 산 지 24년. 그는 난고정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하며 묘역을 찾는 이들에게 김삿갓의 삶과 시를 소개하고 있다.

시선 김삿갓 유적지를 알리는 표지석.
명문가 자손 김병연이 방랑시인 김삿갓으로 산 사연
조선의 세도가 안동 김씨 가문의 자손이었던 김삿갓의 본명은 김병연(1807~1863)이다.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난 그는 스무 살 넘어 처자식을 두고 홀연히 집을 나섰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삿갓을 눌러 쓰고,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하여 사람들은 그를 김삿갓, 김립(金笠)이라 불렀다.
“김병연의 삶이 참 기구해요. 집안이 풍비박산 나면서 출세길이 막혀버렸죠. 1811년 평안도 용강에서 지방 차별과 조정 부패에 항거한 홍경래의 난이 났을 때, 선천부사였던 김병연의 할아버지 김익순은 자진 항복해 목숨을 구합니다. 반란이 진압되자 김익순은 반역죄로 체포돼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역적 집안이 된 김병연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가족 중 어린아이들은 노비로, 어른들은 유배를 보냈다. 김병연의 아버지는 남해로 유배 갔다가 화병으로 생을 마감했다. 문중에서도 배척당해 기댈 곳 없었던 김병연의 어머니 함평 이씨는 할아버지의 일을 숨긴 채 당시 6살이었던 어린 김병연을 데리고 곡산, 광주, 이천, 가평 등지를 전전하다 강원도 영월 깊은 산골에 정착했다. 지금 김삿갓 주거지가 있는 김삿갓면 와석리다.

최상락씨가 난고정에 찾아온 관광객에게 김삿갓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글 읽는 것을 좋아했던 김병연은 열 살 전후에 사서삼경을 모두 통달할 만큼 영특했다”고 최상락씨는 설명했다. 가문을 되살리기 위해 학업에 정진한 김삿갓이 스무 살 되던 해 영월 관아에서 열린 백일장에 나간 것이 그의 운명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백일장 시제가 ‘홍경래의 난 때 적군에게 항복한 선천부사 김익순의 죄를 비판하라’는 것이었다. 김병연은 “임금을 저버린 동시에 조상을 잃어버린 너는 한 번은 고사하고 만 번은 죽어 마땅하다”라며 김익순을 통렬히 비판하는 글을 써서 장원급제한다.
기쁜 마음도 잠시, 자신이 비판했던 대상이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전해들은 그는 죄책감에 집을 나와 삿갓을 쓰고 방랑생활을 시작한다. “당시 삿갓은 모양에 따라 그 쓰임이 달랐습니다. 농사지을 때, 상을 당했을 때, 죄인을 형장으로 끌고 갈 때도 삿갓을 씌웠습니다. 김삿갓은 스스로를 천지간 죄인이라 여기며 하늘을 보지 않기 위해 평생 삿갓을 쓰고 다녔습니다. 전국을 떠돌며 시를 통해 부패한 정치가들과 양반들을 비판하고, 시로 백성들을 위로했죠.”

김삿갓문학관에서는 난고 김병연의 발자취를 좇아 일생을 바친 정암 박영국 선생의 연구자료를 전시 중이다.
운명 같은 이끌림
마흔 무렵, 최상락씨는 어떤 운명 같은 이끌림이 자신을 영월로 안내했다고 말한다.
“여기 오니 내 집을 찾아온 것 같았어요. 낯설지 않고 익숙한 느낌이었죠. 저는 전생의 인연법을 습니다. 전생에 김삿갓과 저의 인연이 나를 영월로 안내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락씨는 영월군과 협의해 김삿갓 주거지에 복원해두었던 집을 거처로 삼았다. 사람이 살지 않은 전시용 집이라 냉기가 돌았다. 불 때고 청소하고 주변을 정비했다. 그렇게 4년 정도 지나니 훈기가 돌았다. 붓을 만져본 적 없었고 글도 쓰지 않았다는 최상락씨는 이상하리만치 붓을 잡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다고 한다. 말로는 뚜렷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상투를 튼 머리에 망건을 씌우는 것도, 한복을 입는 것도, 삿갓을 쓰는 것도 낯설지 않았다. “제가 김삿갓인 듯, 김삿갓이 저인 듯”했다.
“김삿갓이 쓴 ‘원생원’이라는 시를 보면 조선 후기 세도정치 시절, 부패한 권력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해 뜰 때 원숭이가 들에서 나고 황혼에 모기가 처마에 이르렀다. 고양이가 지나가니 원생이가 되고 문첨지는 모기가 됐다’라면서 쥐꼬리만 한 권력을 가지고도 양반입네 행세하는 자들을 모기, 파리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비웃은 것이죠. 부패한 세상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는 김삿갓 시는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의 위로였습니다.”

최상락씨는 난고정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즐겁다.
백성들을 위로했던 시선 김삿갓처럼
최상락씨의 마음처럼 조선시대 백성들도 자신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대변해주는 김삿갓을 좋아했다.
“조선 말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신석우가 쓴 ‘해장집(海藏集)’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시를 외우고 사랑해 혹 얼굴을 보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그를 보면 놀라 좋아하며 다투어 술과 밥을 대접하고, 혹 떠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라는 대목입니다.
김삿갓은 시선(詩仙)이라 평가받을 만큼 뛰어난 글솜씨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위로했다. 최상락씨는 그런 김삿갓의 생에 동화됐다. 그는 57세의 나이에 전남 화순 동복에서 객사한 김삿갓의 시를 소개했다.
“사람은 모두 꼿꼿한데 너는 어찌 그 모양인가 /목은 가슴에 박히고 / 무릎은 어깨에 올라붙어 있다 / 머리를 돌이켜도 / 한낮에 해를 보기 어렵고/ 몸을 비틀어 겨우 하늘을 본다 / 누우면 마음 심(心) 자에 세 점이 없는 모습 같고 / 서면 활 궁(弓)자에 줄 하나가 없는 모양이다 / 천추에 통곡할사 / 죽어 저 세상으로 갈 때에도 / 관도 응당 둥글게 만들어야 하리니”
김삿갓이 생을 마감한 지 3년 지나던 해, 그의 아들 김익균이 화순으로 가 아버지의 유해를 화장해 지금의 묘 자리에 모셨다. 1982년 영월군에서 김삿갓의 묘를 발굴했고, 1989년 김삿갓 유적지를 조성하면서 김삿갓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그를 알리고 있다.
“김삿갓이 방랑생활은 했을지언정 사람들한테 신세만 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글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죠. 저는 원래 문화관광해설사를 하러 영월에 온 것은 아니었고, 세상 공부를 하고 무예의 경지를 높이러 마대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생에 김삿갓이 갚지 못한 빚이 있어서 그걸 갚으라고 저를 보낸 것 같습니다.(웃음) 두루두루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이 또한 보람이고, 제 운명이지요. 난고정에 나와 사람들과 만나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로 소통하는 것도 즐겁고, 좋은 글 하나 써서 선물로 드리는 것도 기쁩니다. 하하하하하.”
* 영월 대표 문화축제, 김삿갓문화제

영월군 4대 축제 중 하나로, 풍류가객 김삿갓의 시대정신과 예술혼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가을 김삿갓유적지 일원에서 열린다. 추모제, 추모살풀이춤, 추모퍼포먼스를 비롯해 한시, 헌다, 휘호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려 김삿갓의 삶과 시 세계를 새롭게 조망한다. 축제 참가자들이 삿갓을 쓰고 섶다리를 건너는 풍경이 장관이다. 김삿갓의 생애와 발자취를 전시한 김삿갓문학관과 2022년 문학관 뒷마당에 조성한 시비공원도 가볼 만하다. 올해 행사는 9월 22~24일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