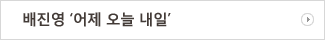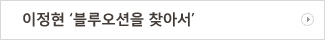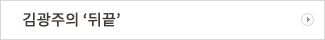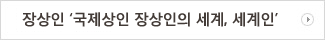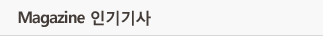- 일러스트=조선DB
2013년 등단한 채길우(蔡佶佑)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측광》(창비)을 읽는다. 그의 시를 읽으면 시 속 이야기들이 느린 영상처럼 독자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시들이 물기를 품은 수채화처럼 사람의 마음을 어떤 색채로 번지게 한다.
시인은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적절히 은유와 비유를 써서 담담히 말하는데 독자들도 한 편의 시를 쓰는 느낌을 갖게 한다. 생각이 많아져 시를 쓰고 싶어진다. 독자의 감정을 이입하게 만든다.
그런데 시인은 흥분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다.
독자는 담담하게 읽지 못한다. 독자들로 하여금 잘 살고 싶은 욕망, 의지, 희망을 갖게 한다.

시집에는 좋은 시들이 많다. 우선 시집 앞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었는데, 대개 감동을 주는 사연들이다. 시 3편을 소개한다. 관찰자 시점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이야기다.
숙모는 오토바이 사고로 의식을 잃은
사촌의 몸을 굴려 등에 난 욕창을 닦아준다.
그리고 아이의 침대 곁에 엎드려 잠든다.
풍뎅이처럼 바구미처럼
숙모는 물속에서 눈 뜨듯 잠에서 깨지만
동공을 열어도 밖으로 나올 수 없는 표면장력만큼
굳은 각질에 싸인 아이의 눈두덩을 어루만지며
여전히 젖지 않는 꿈에서 헤어나지 않는다.
툭툭 건드리면
다리를 웅크린 채 배를 까뒤집고
누런 진물을 짜내어 죽은 척하다가
조금 더 기다리자 얇은 물방울 같은
바삭대는 낙엽 같은 등딱지를 갈라 꺼낸 날개로
온몸을 받쳐 되돌려 세운 후, 곧
날아가버리는 노린재처럼
무당벌레처럼
어서 일어나
장난치지 말고
네게도
날개가 있잖니
- 시 <껍질> 전문
시 <껍질>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사촌과 숙모의 모습을 화자가 관찰하며 썼다. 욕창을 닦아주는 숙모, 상처 부위에서 ‘누런 진물’이 나는 사촌…. 언젠가 ‘바삭대는 낙엽 같은 등딱지를 갈라 꺼낸 날개로’ 날아오르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
아이는 밤새 또래들과
술을 마시다 돌아왔다.
도대체 왜 사냐,
묻지도 않고 그가 아이를 향해
손부터 들어 올릴 때 더이상
아이는 그를 피하지 않는다.
언제 낳아달라고 했어?
말문이 막혀 멈춰 있는 동안
문득 호젓하고 파란 문양 같은 표정의
아이가 그새 많이 컸다.
가마 곁에서
갓 구워진 흠집난 것들을
부수어야 했을 때
어째서 그릇이 아니라
제 손을 치지 못했던가
유약 바른 눈동자 속에서
물레와 함께 빙글빙글 부풀어 오르다
반드럽게 뭉개져 흘러내리는
구겨진 점토만큼 맑은 것
저 파이고 금이 간 자국을
닦아주어야 할까, 망설이다가
이제 자신이 깨뜨리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는 손을 거두고
바라다본다. 손가락 사이로
가만히 처음 마주하는
작자 미상의 작품처럼
아이가 많이 자랐다.
- 시 <도공> 전문
시 <도공>은 아이를 혼내다가 문득 느낀 부모의 감정을 드라마틱하게 썼다. 모든 부모가 공감할 수밖에 없다. 말대꾸를 하는 아이를 보다가 ‘문득 호젓하고 파란 문양 같은 표정’의 아이를 새롭게 만난다. 시인은 아이가 그새 많이 컸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다. 이 대목, 4연이 절창이라고 생각한다. ‘구겨진 점토만큼 맑은 것’, ‘유약 바른 눈동자’에서 아이의 빛나는 성장을 느낄 수 있다.
아무리 꽉 잠가도 밤새 물이 새는
부엌 개수대의 수도꼭지 소리가
아이의 허전한 맥박을 닮아
이 집의 심장을 뛰게 한다.
그녀가 잠을 설치는 이유다.
그녀가 어둠 속에서 깨어나
스스로의 기척 전부를 죽인 채
잠든 아이의 방으로 건너가
너무 얇은 명치께에 귀를 대는 순간
고통스러운 기대감을 고양시키는 공포, 혹은
혼자만의 주기를 가지며
한계점까지 부풀어 올랐다 퇴화되고
재생을 반복하는 투명한 비밀로서
떨어지는 순간 가만히 바라보면
온 세계가 담기기도 하는 씨앗
턱을 따라 침이 흐르는 아이의 입가를
그녀는 깨끗이 닦아준다.
아이는 스무살이 지나도록 말을 배우지 못했지만
햇살 속에서 맑은 물처럼 웃을 때 증발할 듯
찡그린 눈매로 그녀가 참아야 하는 동그랗고 눈부신 발아
새로 고이는 침 줄기를 다시 훔쳐주는 일
그것은 물방울만큼 가볍고 연약한
그녀의 가슴이 매번 주저앉고 흩날려
낙하하는 동안에도 이 악문 미소로
그녀를 살아 있게 하는 의지다.
-시 <숨> 전문
시 <숨>은 아픈 아이를 간병하는 화자인 엄마의 시선이 담겨 있다. 1연에서 이미 독자는 가슴이 무너진다. 2연의 ‘너무 얇은 명치께에 귀를 대는 순간’을 읽으며 독자도 함께 그 문장에 귀를 댄다. 4연의 ‘턱을 따라 침이 흐르는 아이의 입가를’ 독자도 심장을 꺼내 닦아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