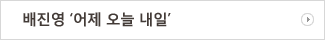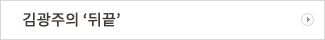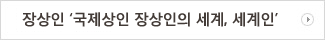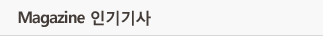- 떼꾼 홍원도씨. 19살에 처음 뗏목을 타기 시작해 1962년과 1963년 두 차례 영월에서 서울까지 가는 ‘서울떼’를 탔다.
1950~1960년대 한강 전통 뗏목 문화 ‘산증인’
육로가 닦이지 않았던 시절, 강이나 하천을 통한 수상 교통은 서민들의 생활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상류에서 하류로 향하는 물류 운송은 오롯이 뱃길 몫이었다. 육로로 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빨랐고,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양도 더 많았다. 한강 물길을 따라 내려가는 뗏목은 영월·정선·평창·횡성 등 강원 내륙과 충북 제천·단양, 그리고 경기 일대와 서울을 이어주는 대표적인 운송 수단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
홍원도(90·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씨는 19살에 처음 뗏목을 탔다. 처음 탄 건 ‘골안떼’다. ‘떼’와 ‘뗏목’은 함께 쓰이는데 한강 일대에서는 ‘떼’라 부르는 경우가 더 흔했다. 정선에서 영월까지, 또는 영월 내에서 비좁고 거친 물길을 내려오는 뗏목을 ‘골짜기 안’으로 간다고 해 골안떼라고 불렀다. 서울까지 가는 ‘서울떼’를 탄 건 군 전역 후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두 차례 서울떼에 몸을 실었다. 이렇게 뗏목을 타고 또 만드는 이들을 ‘떼꾼’이라고 불렀다.
“1962~1963년에 서울떼를 탔어요. 그 당시엔 큰돈이었지. 서울떼 세 번 타면 송아지 한 마리는 살 수 있었으니까. 그러다 팔당댐이 생기면서 물길이 끊겨 못 가게 됐어요. 그 뒤로는 정선서 내려오는 골안떼를 탔죠.”
뗏목은 운송 수단이자 그 자체가 상품이다. 산림 자원이 풍부한 강원도에서 벌목한 소나무를 묶은 뗏목이 강을 따라 내려가 한양 도읍을 짓는 목재로 쓰였다. 뗏목이 시작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한강 상류에서 벌목한 목재를 운송하는 전문가인 떼꾼이 조선 초기부터 존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영월에서 뗏목을 이용한 운송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1867년, 대원군이 임진왜란으로 불탄 경복궁을 다시 지으면서부터로 추정된다. 이후 1960년대 초까지 이어졌던 서울떼는 1966년 팔당댐이 착공되면서 사라졌고 골안떼는 197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철도에 자리를 내어주며 자취를 감추게 됐다.
전국 유일, 전통 뗏목 명맥 이어가는 떼꾼의 마을

동강뗏목축제에서 볼 수 있는 전통 뗏목 재현. 떼꾼들이 뗏목을 타고
영월읍 삼옥리 둥글바위 근처에서 하송리 동강 둔치 행사장까지 약 5km 거리를 내려간다.
영월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가는 물길은 만만치 않았다. 홍씨는 “서울까지 물이 많고 유속이 빠르면 일주일, 가물어 물이 없을 때는 한 달도 걸렸다”며 “여울을 만나 바위에 뗏목이 끼이면 내려서 밀기도 하고 심할 때는 뗏목을 분해했다가 다시 묶기도 하면서 갔다”고 했다. 당시 떼꾼은 뗏목 제작부터 운송까지 2인 1조로 움직였다. 둘이 뗏목을 타고 내려가다 심심하면 주거니 받거니 ‘아라리’를 불렀다. 일종의 노동요다. 동네 어르신들이 종종 불러 어려서부터 익숙했고, 특히 장모가 잘 불러 많이 듣고 따라 불렀다는 게 홍씨의 설명이다. 동강뗏목축제에서 볼 수 있는 전통 뗏목 재현. 떼꾼들이 뗏목을 타고 영월읍 삼옥리 둥글바위 근처에서 하송리 동강 둔치 행사장까지 약 5km 거리를 내려간다.
당시엔 강변 마을마다 주막이 있어 위험한 여울을 지난 뒤에 들러 막걸리 한 사발로 목을 축이거나 두어날 씩 쉬어가기도 했다. 그렇게 서울에 도착해 광나루나 뚝섬, 노량진에 뗏목을 대고 상인에게 넘기면 떼꾼의 역할이 끝났다. 돌아올 때는 기차를 탔다.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면 제천까지 6시간쯤 걸렸다. 제천에서 영월읍까지 버스를 타고 읍내에서 거운리까지 30리(약 13㎞) 길을 걸어 집에 돌아오면 비로소 서울떼꾼의 여정이 끝났다.
수십 년 자취를 감췄던 뗏목이 다시 등장한 건 지난 1997년, 영월군이 ‘제1회 동강축제(현 동강뗏목축제)’를 개최하면서부터다. 한강 상류 주민들의 교통 및 생업수단으로 오랜 세월 숱한 삶의 애환을 품은 뗏목, 그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영월군은 옛 떼꾼들을 다시 물길로 불러냈다. 떼꾼들이 탄 뗏목이 옛 모습 그대로 동강 줄기를 타고 내려와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홍씨는 “나를 포함해 1960년대까지 뗏목을 탔던 몇 사람이 기억을 되살려 뗏목을 다시 만들었다”며 “축제가 열리는 매년 7월 말~8월 초에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전통 방식 그대로 뗏목을 만든다”고 소개했다.
뗏목을 만들고 동강뗏목축제에서 재현하는 등 전통 뗏목 문화 계승의 중심에는 거운리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영월동강뗏목보존회’가 있다. 거운리는 현재 전국을 통틀어 전통 뗏목을 재현해 제작하는 유일한 마을이다. 최고령인 홍씨를 비롯해 주민 40여 명이 참여해 소중한 전통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2020년에는 마을회관에 ‘거운리 뗏목 문화 전수관’이란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1997년부터 뗏목 재현,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도

홍원도씨는 “젊은이들이 동강 뗏목에 관심을 갖고 전통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동강뗏목축제의 재현 행사에서는 영월읍 삼옥리 둥글바위 근처에서 뗏목을 띄워 영월읍 하송리의 동강 둔치 행사장까지 내려간다. 약 5㎞ 거리인데 유속에 따라 빠르면 2시간, 느리면 4시간까지 걸린다. 축제의 시작이자 하이라이트다. 현재 영월군은 동강 뗏목의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렇듯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문제는 후
대의 관심이다. 홍씨는 “마을 주민들이 애쓰고 있지만 가장 젊은 층이 60대라 앞으로 거운리 주민만으로는 영월동강뗏목보존회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영월은 물론이고 외지의 젊은이들이 동강 뗏목에 관심을 갖고 전통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구순 떼꾼의 바람은 더 있다. 영월의 주요 역사 중 ‘낙화암(落花巖)’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것. 낙화암은 영월에 유배된 단종이 승하한 뒤 그를 모시던 궁녀와 시종들이 동강에 몸을 던져 자결했다고 전해지는 절벽으로 영월읍 영흥리 금강공원 내에 있다. 1742년 당시 영월부사가 절벽 위에 낙화암이라 적힌 비석을 세웠는데 1910년 일제 강점기에 파괴돼 지금은 1912년 다시 세운 비석을 볼 수 있다. 2008년에는 절벽 약 10m 아래 지점에서 바위에 새겨진 낙화암 글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홍씨는 “단종에 관한 이야기는 널리 알려졌지만 낙화암은 영월 사람들도 잘 모른다”며 “오래전 뗏목을 타던 때에는 강 건너에서도 절벽에 새겨진 낙화암이란 글자가 또렷이 보였는데 잘 복원해 충절 어린 영월의 역사가 많은 이들에게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동강뗏목축제는…

1997년 시작돼 매년 7월 말~8월 초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동강 둔치 일원에서 사흘간 개최되는 여름 축제다. 단종문화제, 동강국제사진제, 김삿갓문화제와 함께 영월을 대표하는 4대 축제 중 하나로 꼽힌다. 떼꾼들이 옛 방식 그대로 제작한 뗏목을 타고 동강을 내려오는 시연 행사를 비롯해 마칭 밴드와 치어리더 등이 꾸미는 화려한 퍼레이드, 수백 개 드론이 형형색색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라이트 쇼와 불꽃놀이, 각종 공연과 이벤트, 어린이 워터파크. 먹거리 장터 등 볼거리, 즐길 거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올해 동강뗏목축제는 7월 28~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