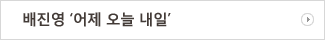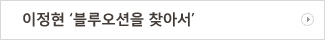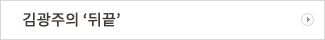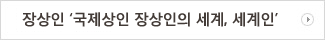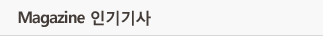.jpg)
- 2013년 최영섭 대령과 기자.
6.25 발발 직후, 부산에 상륙하려던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을 태운 선박을 격침시킨 백두산함 갑판사관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향년 93세. 평생 바다를 사랑했던 '뱃사람'이었고,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무엇보다 나라를 지극히 사랑했던 애국자였다. 5.16 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비서실에서 일했지만, 민정 이양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같이 일하자고 권하자 "각하, 저는 한강을 건너온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말로 거절하고 해군으로 복귀했다.
말년에는 대한해협 전투에서 전사한 부하 수병들의 유족을 찾아 훈공을 인정받게 해 주기 위해 애썼다. 그의 덕분에 50여년 만에 오빠의 장렬한 최후를 알게 된 가족들은 해군창설기념일에 훈장을 대신 받으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고 한다.
월간조선은 2000년대 초부터 백두산함이나 최영섭 대령님에 대한 기사를 여러 번 썼다. 나도 백두산함에 대한 짧은 기사를 쓴 것이 인연이 되어 최 대령님을 알게 됐다.
말년에는 대한해협 전투에서 전사한 부하 수병들의 유족을 찾아 훈공을 인정받게 해 주기 위해 애썼다. 그의 덕분에 50여년 만에 오빠의 장렬한 최후를 알게 된 가족들은 해군창설기념일에 훈장을 대신 받으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고 한다.
월간조선은 2000년대 초부터 백두산함이나 최영섭 대령님에 대한 기사를 여러 번 썼다. 나도 백두산함에 대한 짧은 기사를 쓴 것이 인연이 되어 최 대령님을 알게 됐다.
최 대령님은 매년 연말이면 연하장을 보내오셨다. 최 대령님 연하장의 특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한자가 가득 박혀 있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상투적인 연말연시 인사가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나라사랑의 마음이 절절하다는 것이었다. 2015년을 맞으면서 보내오신 연하장은 이렇게 시작됐다.
"구름낀 조국 땅이 저물어가는데
國泰民安 한 평생 恨이러니
묵은 해는 이제 어디로 가는가
밝아오는 새해에나 희망을 기약해야겠네."
종종 전화를 드리면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90년을 써 먹은 몸이라 여기 저기 다 고장났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지"라고 하시다가 이내 "그런데, 배 기자,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 거요?"라며 목소리를 높이곤 하셨다. 통화를 마칠 때면 "배 기자, 이 나라를 꼭 지켜 줘!"라고 당부하셨다.
그럴 때마다 '내가 뭐 그리 대단한 놈이라고 나같은 놈에게까지 그런 당부를 하시나' 싶어 가슴이 시려왔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해군 장병 부인들이 삯바느질하고 장병들이 월급 일부를 모은 돈으로 미국의 해양실습선을 사다가 포(砲)하나 달아놓고 ‘포함’이라고 좋아했던 분들, 그 배로 나라를 지킨 분들이 최 대령님의 세대였다. 그 분들이 피땀 흘려 이만큼 일군 나라를 우리 세대가 이렇게 망가뜨려 놓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도록 죄송하다.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눈이나 제대로 감으셨을까....
최영섭 대령님이 의식을 놓으시기 전에 아들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글귀는 '대한민국을 밝혀라'였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고인과 그 전우들에게 큰 빚을 졌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