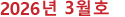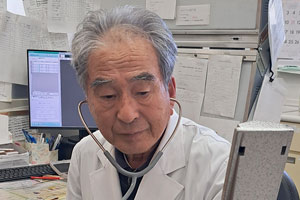⊙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정호승)
⊙ ‘혹 그대가 미련의 말들을 중얼거린다면 코끝에 독한 단내가…’(엄원태)
⊙ ‘혹 그대가 미련의 말들을 중얼거린다면 코끝에 독한 단내가…’(엄원태)

- 전남 영광군 백수읍 백수해안도로에서 바라본 풍경.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다.
12월이다. 한 해가 쏜살같다. 무얼 하며 1년 열두 달을 보냈는지 돌이켜보기 겁이 난다. 잘 살았다는 확신도 없다. 그저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생각만 머리에 맴돈다.
눈물 따위와 한숨 따위를 오래 잊고 살았습니다
잘 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잠깐만 죽을게,
어디서나 목격한 적 없는 온전한 원주율을 생각하며
사람의 숨결이
수학자의 속눈썹에 닿는다
언젠가 반드시 곡선으로 휘어질 직선의 길이를 상상한다
-김소연의 ‘수학자의 아침’ 중
3.14159265358979… 원주율을 일상에서 목격한 적도, 필요했던 적도 없다. 이 무자비한 숫자가 우릴 어떻게 구원해주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삶에 원주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잠깐만 죽을게”라고 해서 원주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수학자는 보통사람이 못 보는 수많은 선과 변을 읽고, 수와 식을 계산하는 사람이다. 그의 눈으로 보면 세상엔 무슨 법칙으로 가득할 것 같다. 우리 운명을 지배하는 법칙을 배우고 싶다. 한 해를 돌아보니 턱턱 숨이 막히고 후회스럽기만 하다. 그 이유를 수학자가 수식으로 풀어주면 좋겠다. 시집 《수학자의 아침》(2013)에 실렸다.
우리는
서로가 기억하던 그 사람인 척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김소연의 ‘희망의 거리’ 중
서로에게 익숙한 사람으로 열두 달을 잘 버텼다. 늘 손해 보며 살았어도 타인에게 익숙한 풍경을 선사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당신의 ‘정든 12월’이 한 손에 여행가방, 다른 한 손에 이불 보따리를 들고 서 있다. 그가 발로 등 뒤의 문을 밀자 2022년의 문이 닫힌다. 쾅! 문이 소리를 내는 순간, 가방이랑 보따리를 떨어뜨린다. 어떤 이야기가, 새해의 어떤 결심이 머리에 떠오르려 한다. 그런데 너무 많은 질문이 쏟아진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살구나무 아래 농익은 살구가 떨어져 뒹굴 듯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너무 많은 질문들이
도착해 있다
-김소연의 ‘누군가 곁에서 자꾸 질문을 던진다’ 중
폐경기의 남자와 우는 남자
12월의 마지막 썰물을 바라본다. 해면이 저 멀리까지 낮아졌다. 손차양을 하며 바라본다. 썰물을 따라잡으려 뛰다가 걷다가 주저앉는다. 개펄에 핀 소금꽃을 본다. 바다가 쓸려간 흔적, ‘끌고 끌린 물의 결’이 보인다. 달이 파도를 끌고 가다 생긴 개펄의 상처를 본다. 무언가의 슬픔, 기쁨으로 뒤범벅된 흔적들로 개펄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 밀물이었을 때 볼 수 없었던 풍경이, 썰물의 나이가 되자 적나라하게 보인다.
개펄에서 누군가의 손이 불쑥 튀어나와 우리의 팔, 다리, 몸을 잡아당길 것 같다. ‘그늘진 밑바닥’ 같은 생이 개펄처럼 엉켜 있다. 여기저기 파도에 쓸려간 흔적밖에 없다고 해도 어쩌랴. 썰물은 공평하게 모든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썰물은 돌아오지 않았다 개펄에 소금꽃 피어 하얗다
끌려가서 끝내는 죽는 바다였다 끌려간 사람도 죽는 바다였다
허리춤 움켜쥐고 끌려갔을 끌린 자국도 마저 끌고 끌려갔을 길게 끌려간 자국 한 줄 그었겠다
잘 죽었느냐고 걱정하며 묻는 지금은 생시이므로
꿈 아니므로 대답 듣지 못한다 기웃이 넘겨다 보이는 돌담 저 아래 그늘진 밑바닥에
여자가 숨겨두고 길들인, 오래 묵어서 녹청빛 나는 여자가 밤마다 품는
괸 웅덩이가 있다 바다가 살아서 드나들 때 짐짓 빠뜨려두고 간 남자 하나
全身水深의 체위로
허리춤 움켜쥐고, 끌고 끌린 물의 결도 꼬옥 끌어 쥐고 잠긴 한 남자의
여자, 민박집 여자가 길게 오래 목물을 끼얹고 있다
-위선환의 ‘폐경기’ 전문
‘폐경기’라는 시를 여러 번 읽는다. 시집 《두근거리다》(2010)에 실렸다. 읽을 때마다 어떤 이미지들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진다. 12월의 해 질 녘 풍경 속 중년의 남과 여가 보인다. ‘여자가 밤마다 품는 괸 웅덩이’ ‘바다가 살아서 드나들 때 짐짓 빠뜨려두고 간 남자 하나’ ‘끌고 끌린 물의 결도 꼬옥 끌어 쥐고 잠긴 한 남자의 여자’라는 문장을 음미해본다.
폐경기 여자의 그 남자도 같은 중년 병을 앓고 있다. 옆구리에 가득했던 살이 몰라보게 쪼그라들었다. 대신 없던 앞배가 풍선처럼 부풀었다. 흰 수염이 나고 어깨와 무릎이 저려온다. 그냥 말을 해도 될 텐데 잔뜩 소리만 지른다. 그러곤 속절없이 눈물을 흘린다.
남자가 운다. 남자는 오래 울고, 오래 우는 남자의 울음은 웅덩이로 고여서, 울음 고인 웅덩이에 들어앉아 울고 있는 남자가 훤하게 들여다보인다. 남자는 그치지 않고 울고, 울음 우는 남자의 등줄기가 다 잠기도록 남자의 울음빛은 깊다. 또는 울음 우는 남자의 목줄기가 다 씻기도록 남자의 울음빛은 맑다. 남자는 아직 울고, 남자가 울지 않는다면, 왜, 아무 까닭 없이, 저렇게, 가을이 깊어지고 맑아지겠는가.
-위선환의 ‘울음빛’ 전문
울보 남자 이야기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울음 고인 웅덩이에 들어앉아 우는’ ‘등줄기가 다 잠기도록 우는’ ‘목줄기가 다 씻기도록 우는’ 남자 이야기다. 아무리 비유라지만 이쯤 되면 소낙비처럼 눈물을 쏟아낸다고 해야 할까.
울음 고인 웅덩이에 들어앉으려면 얼마나 울어야 할까. ‘남자가 울지 않는다면 저렇게 가을이 깊고 맑아지겠는가’라는 시인의 과장을 여성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디까지나 시인의 수사(修辭)지만 그 남자의 가을도 어느덧 12월로 끝자락에 접어들었다.
우는 새와 하느님의 눈물
김소월(金素月)의 시 ‘산’은 우는 새 이야기다. 《개벽》(1923)에 실렸다. 오리나무 위에서 새가 울고 있다. 새는 두메산골의 고개를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나 ‘영(嶺) 넘어가려고 그래서 울지’라는 표현에서 새가 고개를 아직 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눈 내리는 길을 칠팔십 리 걸어서 가지만, 그중 육십 리는 다시 되돌아온다. 떠나온 곳에 대한 미련 때문일까. 가는 길을 되짚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삼수갑산(三水甲山)은 한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다. ‘불귀(不歸), 불귀, 다시 불귀’의 공간이다. 새로운 2023년으로 떠나야만 한다. 울던 울음을 닦고서 이제는 떠나야 한다. 2022년이 다시 올 수 없음을 안다.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산새는 왜 우노, 시메산골
영(嶺) 넘어가려고 그래서 울지.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오늘도 하룻길
칠팔십 리
돌아서서 육십 리는 가기도 했소.
불귀(不歸), 불귀, 다시 불귀
삼수갑산에 다시 불귀.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십오 년 정분을 못 잊겠네
산에는 오는 눈, 들에는 녹는 눈.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삼수갑산 가는 길은 고개의 길.
-김소월의 ‘산’ 전문
정호승 시인은 ‘울지 마라’라고 말한다. 울지 말고 외로움을 견뎌보라고 권한다.
가끔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린다는, 시인만이 알던 비밀을 폭로한다. (시인은 어떻게 해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가슴검은도요새도 외롭고, 나뭇가지에 앉은 새들, 산 그림자, 종소리도 외롭다고 말한다. 모두가 다 외로우니 너만, 물가에 앉은 너만 외롭다고 울지 말라는 것이다. 울지 말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으라고 충고한다. 시 ‘수선화에게’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1998)에 실렸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검은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정호승의 ‘수선화에게’ 전문
그런데 남자에게 있어 ‘울음’은 욕망일까 아닐까. 욕망에서 벗어나면 울음도 부질없을지 모른다.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것도 한 방법일지 모른다. 그렇게 버리고 깎아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래 한 움큼’과 낙타
엄원태 시인의 ‘생각 없이 늙는다는 것’을 읽었다. 1995년에 펴낸 시집 《소읍에 대한 보고》에 실렸다. 시인은 이 삶에서, 더 닳고 부서질 것은 없다고 단언한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미련하게 지껄이지도 말라고 권한다. 자칫 개들에게서 비굴한 시선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할 말을 잃을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래를 한 움큼 씹을 만큼 깊은 삶의 통찰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이 삶에서, 더 닳고 부서질 것은 없다
혹 그대가 미련의 말들을 중얼거린다면
코끝에 독한 단내가 가득할 것이다
그 비굴한 시선을
개들에게서 본 적이 있다
살아온 날들에 대해,
그대가 할 말을 잃을 때
그런 어떤 날,
모래를 한 움큼 입안에 씹게 될 것이다
일생을 될수록이면 서서히,
갖은 애착으로,
그러나 결국은 깎아내고 또 깎아내버린
마음에,
반들반들한 안경만 남은
늙은 그대!
-엄원태의 ‘생각 없이 늙는다는 것’ 전문
‘모래를 한 움큼 씹듯이’ 지난 12개월을 돌아본다. 세상사와 무관하게 살지 않았는데 ‘재미있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 모르겠다.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떠올려본다. 낙타는 무슨 재미로 생을 살아갈까. 저 모래언덕 속을 터벅터벅 걷는, 어제도 걷고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는 낙타! 다리가 부러져 못 걸을 때까지 눕지도 앉지도 않고 평생 걸을 뿐인 낙타….
지금은 외롭지만 ‘돌아올 때’에, 새로운 2023년에는, 등에 어리석은 사람 하나, 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업고서 다시 길을 재촉하기를 소원한다. 시 ‘낙타’는 《창작과 비평》(2002)에 실렸다.
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세상사 물으면 짐짓, 아무것도 못 본 체
손 저어 대답하면서,
슬픔과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
누군가 있어 다시 세상에 나가란다면
낙타가 되어 가겠다 대답하리라.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오겠노라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골라
길동무 되어서.
-신경림의 ‘낙타’ 전문
12월에 읽는 ‘조신설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일연(一然·1206~1289년)의 《삼국유사》 ‘조신조(調信條)’를 음미한다. ‘조신’이란 남자의 덧없음, 무상함을 함께 느껴보면 어떨까. 왜냐고? 12월이니까.
신라 때의 승려 조신이 세달사(世達寺)에 있다가 강릉에 있는 절 소유의 농장 관리인으로 파견되었는데, 그곳 태수(太守)의 딸 ‘김랑’을 보고 한눈에 반하였다.
얼마 후 그녀가 딴 사람에게 출가해버리자 조신은 울면서 김랑을 못내 그리워하며 지낸다. 어느 날 부처를 원망하다가 깜박 낮잠이 든 조신의 꿈에 김랑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여 결혼은 하였으나, 당신을 사랑하여 이렇게 돌아왔노라.”
조신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채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40여 년을 같이 산다. 그동안 자식을 다섯이나 두었다. 그러나 몹시 가난하여 나물죽조차 넉넉히 먹지 못하고 입을 옷도 없었으며, 15세 된 큰아이는 그만 굶어 죽고 만다.
도리 없이 남은 네 자식을 둘씩 서로 나누고 막 헤어지려는 찰나에 꿈을 깨고 보니, 날은 이미 저물어 밤이 이슥히 깊어가고 있었다.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은 조신은 그 뒤로 김랑에게 반하였던 마음을 깨끗이 씻고 불도(佛道)에만 힘썼다고 한다.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조신설화’를 소개한 뒤 운문 형식의 글을 남겼다.
잠시 쾌활한 일 마음에 맞아 한가롭더니, 快適須臾意已閑
근심 속에 남모르게 젊은 얼굴 늙어졌네. 暗從愁裏老蒼顔
모름지기 황량(黃梁)이 다 익기를 기다리지 말고, 不須更待黃粱熟
인생이 한 꿈과 같음을 깨달을 것을. 方悟勞生一夢間
몸 닦는 것 잘못됨은 먼저 성의에 달린 것, 治身臧否先誠意
홀아비는 미인 꿈꾸고 도둑은 재물 꿈꾸네. 鰥夢蛾眉賊夢藏
어찌 가을날 하룻밤 꿈만으로 何似秋來淸夜夢
때때로 눈을 감아 청량(淸凉)의 세상에 이르리. 時時合眼到淸凉
-일연의 ‘잠시 쾌활한 일’ 전문
시 3행의 ‘모름지기 황량(黃梁)이 다 익기를 기다리지 말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당나라 때 소설인 〈침중기(沈中記)〉의 노생(盧生)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
노생이라는 젊은이가 어느 객사(客舍)에서 도사 여동빈(呂洞賓)을 만나 자기의 곤궁한 신세를 한탄하였다. 그러자 여동빈이 베개 하나를 주며, “이것을 베고 누우면 뜻대로 되리라” 하였다. 노생은 베개를 베고 누웠더니 모든 것이 소원대로 되어 부귀공명을 80년간 누렸다. 그러고 일어나 보니 한바탕 꿈이었는데, 여관 주인이 짓던 좁쌀밥[黃粱]이 채 익지도 않은 짧은 동안이었다.
일연은 ‘홀아비의 욕망, 도둑의 욕망도 모두 가을날 하룻밤 꿈만 같다’고 했다. 속세의 즐거움만 알고서 기뻐 날뛰고 애쓰고 있으나 때때로 눈을 감아 ‘청량의 세상’에 이르라고 충고한다. 청량은 인간계의 욕망을 초월한 이상향을 뜻한다.
눈을 감고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청량의 한 해를 꿈꾸시길…. 수고하셨습니다.⊙
눈물 따위와 한숨 따위를 오래 잊고 살았습니다
잘 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잠깐만 죽을게,
어디서나 목격한 적 없는 온전한 원주율을 생각하며
사람의 숨결이
수학자의 속눈썹에 닿는다
언젠가 반드시 곡선으로 휘어질 직선의 길이를 상상한다
-김소연의 ‘수학자의 아침’ 중
3.14159265358979… 원주율을 일상에서 목격한 적도, 필요했던 적도 없다. 이 무자비한 숫자가 우릴 어떻게 구원해주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삶에 원주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잠깐만 죽을게”라고 해서 원주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수학자는 보통사람이 못 보는 수많은 선과 변을 읽고, 수와 식을 계산하는 사람이다. 그의 눈으로 보면 세상엔 무슨 법칙으로 가득할 것 같다. 우리 운명을 지배하는 법칙을 배우고 싶다. 한 해를 돌아보니 턱턱 숨이 막히고 후회스럽기만 하다. 그 이유를 수학자가 수식으로 풀어주면 좋겠다. 시집 《수학자의 아침》(2013)에 실렸다.
 |
| 왼쪽부터 시인 엄원태의 《소읍에 대한 보고》, 정호승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위선환의 《두근거리다》, 김소연의 《수학자의 아침》 |
서로가 기억하던 그 사람인 척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김소연의 ‘희망의 거리’ 중
서로에게 익숙한 사람으로 열두 달을 잘 버텼다. 늘 손해 보며 살았어도 타인에게 익숙한 풍경을 선사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당신의 ‘정든 12월’이 한 손에 여행가방, 다른 한 손에 이불 보따리를 들고 서 있다. 그가 발로 등 뒤의 문을 밀자 2022년의 문이 닫힌다. 쾅! 문이 소리를 내는 순간, 가방이랑 보따리를 떨어뜨린다. 어떤 이야기가, 새해의 어떤 결심이 머리에 떠오르려 한다. 그런데 너무 많은 질문이 쏟아진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살구나무 아래 농익은 살구가 떨어져 뒹굴 듯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너무 많은 질문들이
도착해 있다
-김소연의 ‘누군가 곁에서 자꾸 질문을 던진다’ 중
폐경기의 남자와 우는 남자
 |
| 굽이치는 순천만 습지와 갯벌. 사진=조선DB |
개펄에서 누군가의 손이 불쑥 튀어나와 우리의 팔, 다리, 몸을 잡아당길 것 같다. ‘그늘진 밑바닥’ 같은 생이 개펄처럼 엉켜 있다. 여기저기 파도에 쓸려간 흔적밖에 없다고 해도 어쩌랴. 썰물은 공평하게 모든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썰물은 돌아오지 않았다 개펄에 소금꽃 피어 하얗다
끌려가서 끝내는 죽는 바다였다 끌려간 사람도 죽는 바다였다
허리춤 움켜쥐고 끌려갔을 끌린 자국도 마저 끌고 끌려갔을 길게 끌려간 자국 한 줄 그었겠다
잘 죽었느냐고 걱정하며 묻는 지금은 생시이므로
꿈 아니므로 대답 듣지 못한다 기웃이 넘겨다 보이는 돌담 저 아래 그늘진 밑바닥에
여자가 숨겨두고 길들인, 오래 묵어서 녹청빛 나는 여자가 밤마다 품는
괸 웅덩이가 있다 바다가 살아서 드나들 때 짐짓 빠뜨려두고 간 남자 하나
全身水深의 체위로
허리춤 움켜쥐고, 끌고 끌린 물의 결도 꼬옥 끌어 쥐고 잠긴 한 남자의
여자, 민박집 여자가 길게 오래 목물을 끼얹고 있다
-위선환의 ‘폐경기’ 전문
‘폐경기’라는 시를 여러 번 읽는다. 시집 《두근거리다》(2010)에 실렸다. 읽을 때마다 어떤 이미지들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진다. 12월의 해 질 녘 풍경 속 중년의 남과 여가 보인다. ‘여자가 밤마다 품는 괸 웅덩이’ ‘바다가 살아서 드나들 때 짐짓 빠뜨려두고 간 남자 하나’ ‘끌고 끌린 물의 결도 꼬옥 끌어 쥐고 잠긴 한 남자의 여자’라는 문장을 음미해본다.
폐경기 여자의 그 남자도 같은 중년 병을 앓고 있다. 옆구리에 가득했던 살이 몰라보게 쪼그라들었다. 대신 없던 앞배가 풍선처럼 부풀었다. 흰 수염이 나고 어깨와 무릎이 저려온다. 그냥 말을 해도 될 텐데 잔뜩 소리만 지른다. 그러곤 속절없이 눈물을 흘린다.
 |
| ‘울음 우는 남자의 등줄기가 다 잠기도록 남자의 울음빛은 깊다.’ 그림=조선DB |
-위선환의 ‘울음빛’ 전문
울보 남자 이야기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울음 고인 웅덩이에 들어앉아 우는’ ‘등줄기가 다 잠기도록 우는’ ‘목줄기가 다 씻기도록 우는’ 남자 이야기다. 아무리 비유라지만 이쯤 되면 소낙비처럼 눈물을 쏟아낸다고 해야 할까.
울음 고인 웅덩이에 들어앉으려면 얼마나 울어야 할까. ‘남자가 울지 않는다면 저렇게 가을이 깊고 맑아지겠는가’라는 시인의 과장을 여성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디까지나 시인의 수사(修辭)지만 그 남자의 가을도 어느덧 12월로 끝자락에 접어들었다.
우는 새와 하느님의 눈물
 |
| 김소월의 1925년 진달래꽃 초판본. 사진=한국근대문학관 |
그러나 삼수갑산(三水甲山)은 한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다. ‘불귀(不歸), 불귀, 다시 불귀’의 공간이다. 새로운 2023년으로 떠나야만 한다. 울던 울음을 닦고서 이제는 떠나야 한다. 2022년이 다시 올 수 없음을 안다.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산새는 왜 우노, 시메산골
영(嶺) 넘어가려고 그래서 울지.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오늘도 하룻길
칠팔십 리
돌아서서 육십 리는 가기도 했소.
불귀(不歸), 불귀, 다시 불귀
삼수갑산에 다시 불귀.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십오 년 정분을 못 잊겠네
산에는 오는 눈, 들에는 녹는 눈.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삼수갑산 가는 길은 고개의 길.
-김소월의 ‘산’ 전문
정호승 시인은 ‘울지 마라’라고 말한다. 울지 말고 외로움을 견뎌보라고 권한다.
가끔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린다는, 시인만이 알던 비밀을 폭로한다. (시인은 어떻게 해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가슴검은도요새도 외롭고, 나뭇가지에 앉은 새들, 산 그림자, 종소리도 외롭다고 말한다. 모두가 다 외로우니 너만, 물가에 앉은 너만 외롭다고 울지 말라는 것이다. 울지 말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으라고 충고한다. 시 ‘수선화에게’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1998)에 실렸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검은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정호승의 ‘수선화에게’ 전문
그런데 남자에게 있어 ‘울음’은 욕망일까 아닐까. 욕망에서 벗어나면 울음도 부질없을지 모른다.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것도 한 방법일지 모른다. 그렇게 버리고 깎아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래 한 움큼’과 낙타
 |
|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오겠노라’ |
이 삶에서, 더 닳고 부서질 것은 없다
혹 그대가 미련의 말들을 중얼거린다면
코끝에 독한 단내가 가득할 것이다
그 비굴한 시선을
개들에게서 본 적이 있다
살아온 날들에 대해,
그대가 할 말을 잃을 때
그런 어떤 날,
모래를 한 움큼 입안에 씹게 될 것이다
일생을 될수록이면 서서히,
갖은 애착으로,
그러나 결국은 깎아내고 또 깎아내버린
마음에,
반들반들한 안경만 남은
늙은 그대!
-엄원태의 ‘생각 없이 늙는다는 것’ 전문
‘모래를 한 움큼 씹듯이’ 지난 12개월을 돌아본다. 세상사와 무관하게 살지 않았는데 ‘재미있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 모르겠다.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떠올려본다. 낙타는 무슨 재미로 생을 살아갈까. 저 모래언덕 속을 터벅터벅 걷는, 어제도 걷고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는 낙타! 다리가 부러져 못 걸을 때까지 눕지도 앉지도 않고 평생 걸을 뿐인 낙타….
지금은 외롭지만 ‘돌아올 때’에, 새로운 2023년에는, 등에 어리석은 사람 하나, 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업고서 다시 길을 재촉하기를 소원한다. 시 ‘낙타’는 《창작과 비평》(2002)에 실렸다.
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세상사 물으면 짐짓, 아무것도 못 본 체
손 저어 대답하면서,
슬픔과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
누군가 있어 다시 세상에 나가란다면
낙타가 되어 가겠다 대답하리라.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오겠노라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골라
길동무 되어서.
-신경림의 ‘낙타’ 전문
12월에 읽는 ‘조신설화’
 |
| 《삼국유사》의 ‘조신설화’를 채널A가 드라마로 만들었다. 김랑이 조신에게 찾아와 “당신을 사랑하여 이렇게 돌아왔노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두 사람 뒤에 부처님의 모습이 보인다. |
신라 때의 승려 조신이 세달사(世達寺)에 있다가 강릉에 있는 절 소유의 농장 관리인으로 파견되었는데, 그곳 태수(太守)의 딸 ‘김랑’을 보고 한눈에 반하였다.
얼마 후 그녀가 딴 사람에게 출가해버리자 조신은 울면서 김랑을 못내 그리워하며 지낸다. 어느 날 부처를 원망하다가 깜박 낮잠이 든 조신의 꿈에 김랑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여 결혼은 하였으나, 당신을 사랑하여 이렇게 돌아왔노라.”
조신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채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40여 년을 같이 산다. 그동안 자식을 다섯이나 두었다. 그러나 몹시 가난하여 나물죽조차 넉넉히 먹지 못하고 입을 옷도 없었으며, 15세 된 큰아이는 그만 굶어 죽고 만다.
도리 없이 남은 네 자식을 둘씩 서로 나누고 막 헤어지려는 찰나에 꿈을 깨고 보니, 날은 이미 저물어 밤이 이슥히 깊어가고 있었다.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은 조신은 그 뒤로 김랑에게 반하였던 마음을 깨끗이 씻고 불도(佛道)에만 힘썼다고 한다.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조신설화’를 소개한 뒤 운문 형식의 글을 남겼다.
잠시 쾌활한 일 마음에 맞아 한가롭더니, 快適須臾意已閑
근심 속에 남모르게 젊은 얼굴 늙어졌네. 暗從愁裏老蒼顔
모름지기 황량(黃梁)이 다 익기를 기다리지 말고, 不須更待黃粱熟
인생이 한 꿈과 같음을 깨달을 것을. 方悟勞生一夢間
몸 닦는 것 잘못됨은 먼저 성의에 달린 것, 治身臧否先誠意
홀아비는 미인 꿈꾸고 도둑은 재물 꿈꾸네. 鰥夢蛾眉賊夢藏
어찌 가을날 하룻밤 꿈만으로 何似秋來淸夜夢
때때로 눈을 감아 청량(淸凉)의 세상에 이르리. 時時合眼到淸凉
-일연의 ‘잠시 쾌활한 일’ 전문
시 3행의 ‘모름지기 황량(黃梁)이 다 익기를 기다리지 말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당나라 때 소설인 〈침중기(沈中記)〉의 노생(盧生)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
노생이라는 젊은이가 어느 객사(客舍)에서 도사 여동빈(呂洞賓)을 만나 자기의 곤궁한 신세를 한탄하였다. 그러자 여동빈이 베개 하나를 주며, “이것을 베고 누우면 뜻대로 되리라” 하였다. 노생은 베개를 베고 누웠더니 모든 것이 소원대로 되어 부귀공명을 80년간 누렸다. 그러고 일어나 보니 한바탕 꿈이었는데, 여관 주인이 짓던 좁쌀밥[黃粱]이 채 익지도 않은 짧은 동안이었다.
일연은 ‘홀아비의 욕망, 도둑의 욕망도 모두 가을날 하룻밤 꿈만 같다’고 했다. 속세의 즐거움만 알고서 기뻐 날뛰고 애쓰고 있으나 때때로 눈을 감아 ‘청량의 세상’에 이르라고 충고한다. 청량은 인간계의 욕망을 초월한 이상향을 뜻한다.
눈을 감고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청량의 한 해를 꿈꾸시길….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