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빨간 질그배는 사탕모양 입안에서 녹아나고, 노란빛 가얌은 깨강정보다 열 배나 고수하고(손소희)
⊙ “여기서는 큰 사람이 못 나느니라” 하신 말씀이 이 바닷가의 후일을 두고 하신 예언이 되었으되(김광섭)
⊙ 가난한 집 여자가 일어나 한탄하는 ‘회소, 회소’가 퍽이나 애처로워(이병기)
⊙ 슬프오이다. 당신은 비록 가셨다 하나 당신의 예술은 길이…(박종화)
⊙ 8·15해방 이후로 걸핏하면 가두로 뛰어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된 이 나라, 이 땅의 학도들이 가엽기 짝이 없다(김을한)
[편집자 註]
《월간조선》은 추석을 맞아 작고(作故) 문인들이 쓴 가을과 추석에 관한 에세이들을 발굴, 소개한다. 지금은 폐간되어 사라진 신문과 잡지에서 발췌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글들이다. 여기에 해공 신익희(海公 申翼熙) 선생이 6·25 당시 쓴 추석 이야기를 추가했다. 수필 〈전시(戰時) 추석절 유감(有感)〉은 집현사가 1965년 펴낸 《한국수필문학선집》 제2권 ‘작고인(作故人)’ 편에 포함했을 만큼 문학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현대어 표기로 고쳤으며 글의 맛을 위해 일부 표현은 그대로 두었다. 출처를 밝혔으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글을 발표할 당시의 연대(年代)만 표기했다.
⊙ “여기서는 큰 사람이 못 나느니라” 하신 말씀이 이 바닷가의 후일을 두고 하신 예언이 되었으되(김광섭)
⊙ 가난한 집 여자가 일어나 한탄하는 ‘회소, 회소’가 퍽이나 애처로워(이병기)
⊙ 슬프오이다. 당신은 비록 가셨다 하나 당신의 예술은 길이…(박종화)
⊙ 8·15해방 이후로 걸핏하면 가두로 뛰어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된 이 나라, 이 땅의 학도들이 가엽기 짝이 없다(김을한)
[편집자 註]
《월간조선》은 추석을 맞아 작고(作故) 문인들이 쓴 가을과 추석에 관한 에세이들을 발굴, 소개한다. 지금은 폐간되어 사라진 신문과 잡지에서 발췌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글들이다. 여기에 해공 신익희(海公 申翼熙) 선생이 6·25 당시 쓴 추석 이야기를 추가했다. 수필 〈전시(戰時) 추석절 유감(有感)〉은 집현사가 1965년 펴낸 《한국수필문학선집》 제2권 ‘작고인(作故人)’ 편에 포함했을 만큼 문학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현대어 표기로 고쳤으며 글의 맛을 위해 일부 표현은 그대로 두었다. 출처를 밝혔으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글을 발표할 당시의 연대(年代)만 표기했다.
추석 삽화(揷話)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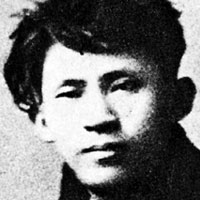 1년 360일, 그중의 몇 날을 추려 적당히 계절 맞춰 별러서 그날만은 조상을 추억하며 생의 즐거움에서 멀어진 지 오래된 그들 망령을 있다 치고 위로하는 풍속을 아름답다 아니할 수 없으리라. 이것을 굳이 뜻을 붙여 생각하자면 그날그날의 생의 향락 가운데서 때로는 사(死)의 적막을 가끔 상기해보며. 그러함으로써 생의 의의를 더한층 깊이 뜻있게 인식하도록 하는 선인들의 그윽한 의도에서 나온 수법이 아닐까?
1년 360일, 그중의 몇 날을 추려 적당히 계절 맞춰 별러서 그날만은 조상을 추억하며 생의 즐거움에서 멀어진 지 오래된 그들 망령을 있다 치고 위로하는 풍속을 아름답다 아니할 수 없으리라. 이것을 굳이 뜻을 붙여 생각하자면 그날그날의 생의 향락 가운데서 때로는 사(死)의 적막을 가끔 상기해보며. 그러함으로써 생의 의의를 더한층 깊이 뜻있게 인식하도록 하는 선인들의 그윽한 의도에서 나온 수법이 아닐까?
이번 추석날 나는 돌아가신 삼촌 산소를 찾았다. 지난 한식날은 비가 와서 거기다 내 나태(懶怠)가 가하여 드디어 삼촌 산소에 가지 못했으니, 이번 추석에는 부디 가보아야겠고, 또 근래 이 삼촌이 지금껏 살아 계셨던들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적이 많아서 중년에 억울히 가신 삼촌을 한번 추억해보고도 싶고 한 마음에서 나는 미아리(彌阿里)행 버스를 타고 나갔던 것이다.
온 산이 희고 온 산이 곡성으로 하여 은은하다. 소조(蕭條)한 가을바람에 추초(秋草)가 나부끼는 가운데 분묘는 5년 전에 비하여 몇 배나 늘었다. 사람들은 나날이 저렇게들 죽어가는구나 생각하니 적이 비감(悲感)하다. 물론 5년 동안에 더 많은 애기가 탄생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렇게 날로날로 지상의 사람이 바뀐다는 것도 또한 슬픈 일이 아닌가?
다섯 번 조락(凋落)과 맹동(萌動)을 거듭한 삼촌 산소의 꽤 거친 모양을 바라보고 퍽 슬펐다. 시멘트로 땜질한 석상(石床)은 틈이 벌어졌고 친우 일동이 해 세운 석비(石碑)도 좀 기운 듯싶었다.
분토 한 곁에 앉아 잠시 생전의 삼촌의 그 중엄하기 짝이 없는 풍모를 추억해보았다. 그리고 운명하시던 날, 장사 지내던 날, 내가 제복 입었던 날들의 일, 이런 다섯 해 전 일들이 내 심안을 쓸쓸히 지나가는 것이었다.
나는 또 비명(碑銘)을 읽어보았다. 하였으되….
공렴정직(公廉正直) 신의우독(信義友篤)
금란결계(金蘭結契) 공동우락(共同憂樂)
중세최절(中世摧折) 사우감동(士友感動)
한산편석(寒山片石) 이표충정(以表衷情)
삼촌 구우(舊友) K씨의 작으로 내 붓 솜씨이다. 오늘 이 친우 일동이 세운 석비 앞에 주과(酒果)가 없는 석상이 보기에 한없이 쓸쓸하다.
그때 그 이웃 분묘에 사람이 왔다. 중노의 여인네가 한 분, 젊은 내외인 듯싶은 남녀, 10세 전후의 소학생이 하나, 네 사람이다. 젊은 남정네는 양복을 입었고, 젊은 여인네는 구두를 신었다. 중노의 여인네가 보퉁이를 열어 주를 갖춘 조촐한 제상을 차렸다. 그러고 향을 피우고 잔을 갈아 부으며 네 사람은 절한다.
양복 입은 젊은 내외의 하는 절이 더한층 슬프다. 그리고 교복 입은 학생의 하는 절은 너무나 애련하다. 중노의 여인네는 호곡한다. 호곡하며 일어날 줄을 모른다. 젊은 내외는 소리 없이 몇 번이나 향 피우고 잔 붓고 절하고 하더니 슬쩍 비켜섰다. 소학생도 따라 비켜섰다.
비켜서서 그들은 멀리 건너편 북망산(北邙山)을 손가락질도 하면서 잠시 담화하더니 돌아서서 언제까지라도 호곡하려 드는 어머니를 일으킨다. 그러나 좀처럼 일어나려 하지 않는다.
그때 이날만 있는 이 북망산 전속의 걸인이 왔다. 와서 채 제사도 끝나지 않은 제물을 구걸한다. 그 태도가 마치 제 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과 같이 퍽 거만하다. 부처(夫妻)는 완강히 꾸짖으며 거절한다. 승강이가 잠시 계속된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앉은 동안에 내 등 뒤에서 이 또한 중노의 여인네가 한 손자인 듯싶은 동자의 손을 이끌고 더듬더듬 내려왔다. 오면서 분묘 말뚝을 하나하나 자세히 조사한다. 필시 영감님의 산소 위치를 작년과도 너무 달라진 이 천지에서 그만 묘연히 잊어버린 것이리라.
이 두 사람은 이윽고 내 앞도 지나쳐 다시 돌아 그 이웃 언덕으로 올라간다. 그래도 좀처럼 “여기로구나” 하고 서지 않는다.
건너편 그 거만한 걸인은, 시비의 무득(無得)함을 깨달았던지, 제물을 단념하고 다시 다음 시주를 찾아서 간다.
걸인은 동쪽으로, 과부는 서쪽으로….
해는 이미 일반(日半)을 지났으니, 나는 또 삶의 여항(閭巷)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
‘코스모스’ 핀 언덕을 터벅터벅 내려오면서 그 과부는 영감님의 무덤을 찾았을까 걱정하면서 버스 곳까지 오니까 모퉁이 목로술집에서는 일장의 싸움이 벌어진 중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거상 입은 사람끼리다.
(출처 《매일신보》 1936년 10월 16일 자 1면)
서울에 와서 (애상의 가을을 보냅니다)
김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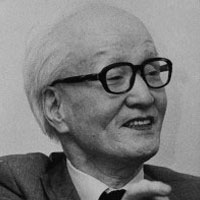 서울에 와서 수도가 다시 서울로 복귀된 뒤에 처음으로 서울에 오니 감회가 자못 무량(無量)하다. 작년 6월에 서울에 왔을 때에는 반공포로 석방 문제로 떠들썩하던 판이었고, 나이 어린 남녀 학생들이 가두로 ‘데모’ 행진을 하면서 북진통일(北進統一)을 부르짖었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 미군 철수 반대의 시위행진이 처처(處處)에 전개되어 지나간 1년간의 시국의 변천을 말하는 듯, 8·15해방 이후로 걸핏하면 가두로 뛰어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된 이 나라, 이 땅의 학도(學徒)들이 가엽기 짝이 없다.
서울에 와서 수도가 다시 서울로 복귀된 뒤에 처음으로 서울에 오니 감회가 자못 무량(無量)하다. 작년 6월에 서울에 왔을 때에는 반공포로 석방 문제로 떠들썩하던 판이었고, 나이 어린 남녀 학생들이 가두로 ‘데모’ 행진을 하면서 북진통일(北進統一)을 부르짖었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 미군 철수 반대의 시위행진이 처처(處處)에 전개되어 지나간 1년간의 시국의 변천을 말하는 듯, 8·15해방 이후로 걸핏하면 가두로 뛰어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된 이 나라, 이 땅의 학도(學徒)들이 가엽기 짝이 없다.
나는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자라났다. 그리고 40 평생을 서울의 공기를 마시고 살아왔다. 말하자면 나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그리운 고향인 것이다. 이 같은 서울에 와서 내가 여관에서 숙식을 하게 될 줄이야 어찌 꿈엔들 상상이나 하였을까 보냐? 그야말로 객지 아닌 객지 생활을 하게 되니, 외롭고 쓸쓸한 생각과 함께 인생무상의 비애(悲哀)를 금할 수가 없다. 한양 한양조 500년의 옛 도읍이던 서울, 일제 치중(治中) 36년간에도 옛 모습을 그대로 고이 간직하여 온 서울이 6·25동란으로 이같이 깨어지고 부서질 줄은 참으로 몰랐었다.
일목일초(一木一草)가 정들지 않은 것이 없고
무엇 때문에 해방이며, 무엇 때문의 독립인지를 알 수가 없다.
정든 고향을 파괴하고 피를 나눈 형제가 서로 죽이기 위해서 대망(待望)하여 온 8·15가 아닐진대, 운명의 장난도 너무나 악착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매일 틈만 있으면 이 거리 저 거리로 옛 터전을 찾아다니었다. 서울은 부산과 달라서 일목일초(一木一草)가 정들지 않은 것이 없고, 그리웁지 않은 것이 없다. 그만큼 가지가지 추억도 많으므로, 허물어진 집터에 서서 나 혼자서 눈물지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다만 북악산(北岳山)과 인왕산(仁旺山)과, 그리고 남산(南山)이 여전히 장안(長安)을 굽어보고 섰는 것은 다시없는 기쁨이었으나, 이미 서울에서는 볼 수 없게 된 수많은 선배와 친구를 생각하니 ○가 아프도록 마음이 슬프다. 무너진 건물은 다시 세우면 될 것이요, 소실(燒失)된 물자는 해외에서 구하여 오면 그만이다. 우리의 안계(眼界)에서 사라진 허다한 인재(人才)들은 다시 돌아올 기약(期約)이 없으니 이상(以上)의 손실이 또 어디 있을까 보냐?
뭐니 뭐니 하여도 6·25로 인한 최대의 손실은 좋은 사람, 훌륭한 일꾼들을 많이 잃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종로 YMCA를 찾아갔다.
붉은 벽돌로 지은 그 웅장한 4층 건물은 이미 볼 수가 없고 오직 한○, 1층 담벼락만이 남아 있어서 YMCA의 유적(遺跡)임을 말하고 있다. 붉은 담벼락 표면에는 흰 ‘뺑키(페인트-편집자)’로
‘1907년 와노 메카 씨(氏) 기증’
[당시 건물은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John Wanamaker·1838~1922년)의 4만 달러 쾌척과 각계각층의 위정자들과 시민, 독지가들의 후원을 통해 1907년 5월 중순부터 공사의 첫 삽을 뜰 수 있었다. 설계 감리는 돈함(B. C. Donham)이 맡았고, 공사는 헨리 장(Henry Chang)이라는 중국인이 맡았다.-편집자]
이라고 쓰여 있어 YMCA의 45년 역사를 표시하였고, 폐허가 된 내부의 판잣집 속에서는 귀여운 유치원 어린이들이 합창을 하고 있었는데 참으로 눈물겨웠다.
상전(桑田)이 벽해(碧海)가 된다 하더니 YMCA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줄이야 어찌 또 알았으랴. 난 어려서부터 YMCA를 무척 좋아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하였으니 30여 년간이나 YMCA의 신세를 진 셈이다. 원로 회원이 못 되어도 준(準)원로 회원쯤은 될 것이 틀림없다.
내가 ‘핑퐁(탁구)’을 치고 ‘바스켓볼’을 배운 것도 YMCA이고, ‘피아노’나 ‘바이올린’과 같은 서양 음악을 듣기 시작한 것도 YMCA요, 커피차(茶)나 ‘오트밀’을 처음 먹은 것도 YMCA이며, 근대식 연설이나 서(西)구라파의 신문, 잡지 등을 읽게 된 것도 모두 YMCA에서 배운 것이니, YMCA야말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신문화 수입의 원조였던 것이다.
YMCA만 가면 어쩐지 서양 냄새가 풍기고, 그 당시에는 보기 드물던 미국인을 용이하게 볼 수 있다는 매력이, 특히 소년시대의 내 마음을 이끈 것도 사실이지만, YMCA에는 우리 사회의 일류(一流) 인물들이 운집(雲集)해 있었음이 우리를,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끈 것도 또한 사실이었다.
그때에는 월남(月南) 이상재(李商在) 선생과 좌옹(佐翁) 윤치호(尹致昊) 선생께서 최고 지도자로 계셨는데, 태산(泰山)과 같이 위엄이 있고 우수하신 월남 선생과 총명하고도 영롱하신 좌옹 선생의 인자스러운 얼굴을 무시로 뵈옵는 것도 YMCA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행복이었다. 그다음으로는 신흥우(申興雨) 박사와 구자옥(具滋玉) 선생의 총무의 시대도 있었으나, 현재 생존하여 서울에 계신 분은 신 박사 단 한 사람뿐이다.
월남 선생의 제자로 좌옹 선생의 신임을 받아 그의 일생을 YMCA에서 봉사한 구자옥 선생은 애처롭게도 6·25 때 이북으로 납치된 채 우금(于今) 소식이 묘연하니, 평시에도 정신력으로 겨우 건강을 유지해오시던 구 선생이심에, 더구나 적지(敵地)에서 지금까지 생명을 보존하고 계실까는 크나 큰 의문인 것이다. 나에게는 권력도 없고, 재력도 없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를 뫼시고, 사회에 나가서는 다시 만나기 어려운 일대(一代)의 위인(偉人)들을 알게 되어, 또 그분들의 신뢰와 총애를 받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큰 행복으로 생각한다. 지금도 나에게는 좋은 선배와 훌륭한 친우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행복을 어찌 비속(卑俗)된 권력이나 재력에다 비할까 보냐? 연고로 나의 마음은 항상 명랑하고, 이미 유명(幽明)을 달리하게 된 허다한 인물들을 한 번 대해보지도 못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엾게도 생각이 든다.
구자욱 선생도 나를 가장 이해하고 사랑해준 분의 한 사람인데, 60 평생을 YMCA에서 늙었고, 해방 후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에 납치된 채 소식을 모르니 애석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는 외유내강(外柔內剛)한 분으로, 나와의 30년 교유(交遊) 중 단 한 번도 눈살을 찌푸려본 일이 없으며, 청렴 강직한 점으로는 첫손가락을 꼽을 만하고 성정(性情)이 고운 양심적인 선배였다. YMCA의 ○○에 서서 이일저일 왕사(往事)를 회고(回顧)하니 만감이 교차하여 가슴이 막히는 듯 나는 한참 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다. 6·25 때 나는 허다한 친지를 잃어버렸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죽은 아기가 더 귀여운 심리일지 몰라도 납치되고 실종된 인사치고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구자옥, 양주삼(梁柱三), 김춘기(金春基), 정인익(鄭寅翼), 이정수(李貞洙), 김형원(金炯元), 마태영(馬泰榮), 이의식(李義植), 김사연(金思演), 김익동(金益東)씨 등은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는 분들이다. 모두 다 나와는 수십 년간 교분 있는 사람들로서, 특히 염파(念坡) 정인익 형은 친형제나 다름없이 자별하게 지내온 만큼 더욱 마음이 거리낀다. 6·25 당시 나는 관수동에, 염파 형은 돈의동에 숨어 지냈는데 7월 초순 어느 날 저녁에 그는 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서울은 위험하니 시급히 서울을 떠나라’는 기별을 하였다.
그것은 염파를 찾아온 어떤 공산당원의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김모가 발견되면 무사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놀래어서 나에게 급보를 전한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탈출할 궁리를 하고 있던 터인데, 그 말을 듣고 보니, 더구나 서울에 있기가 싫어서 나는 부랴부랴 짐을 꾸려가지고 바로 그 이튿날 시골로 떠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는 것이 나는 비록 구사일생(九死一生)이나마 잔명(殘命)을 보존하였건만 정작 염파는 9·28 직전에 이북으로 끌려갔으니 사람의 운명(運命)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다.
인격으로나 견식(見識)으로나 또한 덕망으로나 조고계(操觚界·문필 종사자의 사회-편집자)의 제1인자였던 그를 잃은 것은 우리 언론계의 일대(一大)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염파는 과연 살았는지 죽었는지 사생을 같이하자던 친지가 없어진 서울은 어딘가 텅 빈 것 같다.
서울은 나의 고향이다. 내가 나고 자란 곳이다. 그러나 서울은 벌써 예전의 서울이 아니다. 삼라만상이 다 변한 듯 모든 것이 눈 설고 애처롭게 느껴지며, 사람들조차 딴사람같이 보여진다.
다만 한 가지 변화하지 않는 것은 오늘도 어제와 같이 차세대의 젊은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고, 아침이면 학교에 가는 남녀 학생들이, 학도들이 거리에 충만한 것이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평소부터 존경하고 있던 정계의 요인 R씨를 찾아갔더니 그는 나를 보고
“우리나라의 형편은 여러 가지가 참으로 곤란하지만 매일 아침에 거리에 나가 보면 새로운 용기가 납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느라고 분주하게 다니는 광경을 보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말에 난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 젊은이들을 다시 사지(死地)에 넣지 않고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그것은 나이 먹은 사람들의 책임이 아닐까요?”
나는 지금 ‘객지(客地) 아닌 객지’에서 애상(哀傷)의 가을을 보고 있다.
-1954년 10월 15일-
(在동경 유엔군기자구락부원)
(출처 《새벽》 1954년 12월호)
모종신범(暮鍾晨梵)의 무아경(無我境)
한용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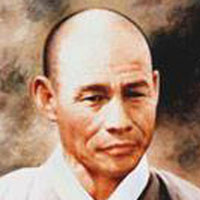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그것은 무슨 습관이나 제도로서가 아니라, 자연과 인사(人事)가 독서에 적의(適宜)하게 되는 까닭이다. 자연으로는 긴 여름의 괴로운 더위를 지나서 맑은 기운과 서늘한 바람이 비롯는 때요, 인사로는 자연의 그것을 따라서 백사앙장(百事鞅掌·매우 바쁘고 번거로움-편집자)한 여름 동안에 땀을 흘려가며 헐떡이던 정신과 육체가 적이 가쁘고 피곤한 것을 거두고 조금 편안하고 새로운 지경으로 돌쳐서게 되는 까닭이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그것은 무슨 습관이나 제도로서가 아니라, 자연과 인사(人事)가 독서에 적의(適宜)하게 되는 까닭이다. 자연으로는 긴 여름의 괴로운 더위를 지나서 맑은 기운과 서늘한 바람이 비롯는 때요, 인사로는 자연의 그것을 따라서 백사앙장(百事鞅掌·매우 바쁘고 번거로움-편집자)한 여름 동안에 땀을 흘려가며 헐떡이던 정신과 육체가 적이 가쁘고 피곤한 것을 거두고 조금 편안하고 새로운 지경으로 돌쳐서게 되는 까닭이다.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 하지마는 낮보다도 밤을 이름이니, ‘추야장(秋夜長)’이라면 자연히 독서와 회인(懷人)을 연상(聯想)하게 되는 것이다. 독서라는 것은 문자 전공하는 사람의 일뿐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아니할 수 없는 집무(執務)를 하여 가면서 틈틈이 하게 되나니, ‘낮에 밭 갈고 밤에 글 읽는다’는 말이 특히 그러한 뜻을 대표할 만한 말이다.
그러나 나는 일생을 통하여 집무 때문에 독서를 할 만한 시간은 흔히 적었다. 그리하여,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피로를 못 견딘다든지 하는 때가 별로 없어서, 가을이 아니라도 또는 밤이 아니라도 글을 읽을 만한 시간과 경우를 많이 가졌었지마는, 그것의 대부분을 무위방랑(無爲放浪)에 소비하고 독서에 제공한 시간은 극히 적었다.
더우기 근년에는 독서가 거의 절무(絶無)하다고 할 수가 있으니, 그것은 게으른 것도 한 원인이지마는, 의식적으로 별로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까닭이다. 그것은 ‘인생’이란 것을 독서 이외에서 찾아보려는 의도이다. 그러고 보면, 설문한 ‘독서삼매경’이라는 것을 대답하기는 불가능이다. 하기야 석일(昔日)의 회상을 들추어본다면, 그대로 적을 만한 것이 그다지 없지도 아니하겠지마는, 지금 의식적으로까지 독서를 잘 않는 사람으로 독서에 대한 과거의 낙사진[落謝塵, 현재의 법(法)이 그 작용을 그치고 과거로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불교용어-편집자]을 들춘다는 것이 별로 재미있는 일이 못 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독서법이 있다.
‘아유일권경(我有一卷經) 불인지묵성(不因紙墨成) 전개무일자(展開無一字) 상방대광명(常放大光明).’(나에게 한 권의 경이 있는데 그것은 종이나 먹으로 된 게 아니다. 종이나 먹으로 된 게 아니므로 펼쳐보아야 글자 하나 없지만 항상 광명을 놓고 있더라-편집자)
이것이 나의 독서신법(新法)이다. 나는 가을을 맞이하자,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모종신범(暮鐘晨梵)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거니와, 기왕 삼매경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흔히 ‘혼침도격[昏沈掉擊·정신이 혼미하고 들뜬 상태. 다른 불교서적에는 도거(掉擧)로 표현되어 있다.-편집자]’의 교란(攪亂)을 받는다. 언제나, 모든 망상을 제거하고 나의 독서법을 완성할는지 답답한 일이다.
(출처 《조광》 1936년 10월호)
만월대(滿月臺)의 가을
이태준
 개성서 ‘가을 글’을 써 보내라 하니 개성서 만월대의 가을을 거닐던 생각이 나오.
개성서 ‘가을 글’을 써 보내라 하니 개성서 만월대의 가을을 거닐던 생각이 나오.
나는 한동안 개성에 자주 다니었소. 가을엔 처가에 가는 것보다 만월대에 오르기가 더 급(急)하여서 짐만 없으면 만월대로 바로 가기도 여러 번 있었소.
만월대는 처가에 비기면 매우 쓸쓸한 곳이었소. 반가이 맞아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소. 그러나 나에겐 처가만 못하지 않게 그의 품에 안기기가 낙이었소.
사람의 손자리는 사라져 고석(古石)이 된 주춧돌이며 산(山)마루와 같이 지나는 바람에 마른 풀잎들만 우는 덩그렇니 비인 터전들, 그 마당에서 벌레들을 밟으며 거닐 때 나는 정말이지 불타 없어진 왕씨(王氏)네의 궐우(闕宇)가 보고 싶던 않았소. 그렇게 텅 비인 터전만 남은 것이 좀 먹은 누각들이 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음속에 사무치는 것이 컸소. 허(虛)란 실(實)보다 더욱 위대한 존재임을 만월대를 거닐며 느끼곤 했소.
어디라고 가을치고 마른 풀이 없겠소. 어디라고 가을치고 벌레소리가 없겠소. 그러나 만월대의 풀과 벌레들은 슬픈 노래의 선수들 같았소. 어디라고 폐허(廢墟)가 없고, 어디라고 풍월(風月)이 없겠소. 그러나 만월대의 그것들은 인생의 슬픈 이야기 책의 삽화(揷畫)들이었소.
만월대는 무엇인가?
행여 고려의 궁(宮)터라 이르지 마오. 만월대의 주인은 고려는 아니오. 거기서 해마다 솟아나는 이름 없는 풀들도 아니요, 지나고 지나고 그칠 줄 모르는 달이며 바람이며 모다 그의 주인은 아니오.
요즘과 같은 가을날 한때 고요히 겸허(謙虛)한 마음으로 올라보시오. 만월대의 주인은 적막(寂寞)이오.
이 전 처가는 없어졌어도 만월대의 가을을 거닐러 한번 개성에 가고 싶소.
(출처 《고려시보》 1933년 10월 1일 자 8면)
나와 가을과 고향
손소희
 먼 먼 고향의 가을 하늘… 나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그 하얀 길 위를 달달달 굴러가는 소술기(술기는 ‘수레’의 함경도 방언-편집자) 위에 앉아, 저무는 가을을 마음으로 거두어야 했다.
먼 먼 고향의 가을 하늘… 나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그 하얀 길 위를 달달달 굴러가는 소술기(술기는 ‘수레’의 함경도 방언-편집자) 위에 앉아, 저무는 가을을 마음으로 거두어야 했다.
왼편으로는 나지막한 산들이 병풍같이 둘러져 있고, 남쪽으로는 버들 방축, 저편으로는 하얀 모래밭과 맑은 시내가 흐르고 있다.
산 둘레는 붉고 누르게 단풍이 진 나무 잎사귀와 푸른 소나무로 빽빽이 차 있다. 그 속에는 새빨간 질그배[산사(山査)나무-편집자]와 노란빛 가얌(개암-편집자)과 갈색 도토리와 향기 높은 돌배와 이러한 것들로 차 있는 다람쥐 굴이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깊은 산골엔 그러한 것으로 그득히 차 있다는 곰의 굴도 있다는 것이다.
그 곰의 굴 안에 있는 새빨간 질그배는 사탕모양 입안에서 녹아나고, 노란빛 가얌은 깨강정보다 열 배나 고수하고, 갈색 도토리는 달고 노글노글한 엿 같으며, 향기 높은 돌배는 꿀이 왔다가 울고 갈 정도로 별미(別味)라는 것이다.
이것들은 몬테크리스트의 보석(寶石)의 동굴과도 같이 호기심으로 어린 가슴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이야기 거리기도 하였다.
달달달 굴러가는 소술기 위에서 나는 그러한 이야기 속을 더듬고 있었다.
그러나 눈앞과 그 주변에는 볏단을 쌓아 올린 볏무지와 벼를 잘라낸 그루터기들이 단조(單調)로운 무수한 무늬와 같이 끝없이 땅 위에 돋아 있을 뿐이다.
문득 저 멀리 길의 맞은 켠 쪽으로부터 벼낟가리 같은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드디어 길 밖으로 나온다. 산더미같이 벼를 실은 소술기인 것이다. 소술기는 이쪽을 향해 덜거덕 덜거덕 굴러온다. 내가 탄 소술기는 달달달 저쪽을 향해 굴러간다. 그 앞에는 거꾸로 박힌 눈과 푸른 수염을 단 도깨비 왕이 어깨를 살려가지고 팔을 드리운 듯한 천하 대장군지문(天下 大將軍之門)이 있다. 벼를 실은 소술기는 그사이 그 문을 빠져나오더니,
“아아, 자넨가? 어떻게 거의 끝나나?”
“끝나는 게 다 뭐야? 앞으로두 닷새는 더 걸려야 할까 보이. 자네네는 어때? 끝나가나?”
하는 머슴들의 느리고 굵은 악센트가 들려온다.
순간 나는 다풀머리를 흔들어 머리카락을 추키며, 허리를 쭉 펴고 소술기 안에서 키를 높인다. 그러한 나를 발견한 상대방 머슴은 어리둥절한 낯으로 나와 우리 집 머슴을 번갈아 보며,
“아니, 그런데 젖먹이(막내) 색씨(아가씨)는 왜?” 한다.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벼 심으러 가는 소술기에 왜 앉아 가느냐 하는 뜻이다. 우리 집 머슴이 나를 돌아다보고 씩 웃는다. 누우런 이빨이다. 나는 못 본 체 주저앉아서 바른편 눈꼬리로 흘러드는 하얀 구름은 어디까지 가는 걸까, 구름은 떠가는 것이 재미나는 모양인가, 집은 어딜까, 이런 따위 생각도 하고, 재수가 좋으면 논두렁의 말라든 풀 덩굴 속에서 빨간 꽈리를 가지고 멋지게 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눈을 깜빡여도 본다.
한편 걸어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섬찟해지기도 한다. 잔뜩 벼를 실은 술기 뒤를 따라 큰길로 타박타박 걷는다는 것은 멀고 지루한 일이다. 그래서 샛길로 빠져들 생각을 한다. 샛길이란 추수를 끝낸 논바닥을 이용하는 것이다.
논바닥에는 벼 그루터기들이 옹기종기 돋아 있다. 옹기종기 돋아 있는 벼 그루터기를 한 걸음에 세 낱씩 건너 밟는다면 심심치 않거니와, 빨리 걸을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생각도 한다. 예를 써서 벼 실려가는 빈 소술기에 앉아 호사를 하면서도, 은근히는 이렇게 걸어 돌아올 길이 걱정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옛이야기다.
그러나 지금도 가을철이 돌아올 때마다 나를 고향으로 이끄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금 그때의 그 느리고 굵은 악센트의 머슴들은 아직도 그 하얀 길 위로 그렇게 소술기를 몰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출처 《한국여류수필전집》(상하권), 1965, 국제문화사)
나와 고향과 가을
김광섭
 Ⅰ
Ⅰ
글을 써온 지 7~8년 되었고 시(詩)에 붓을 대인지 몇 해 되었어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말한 일도 없고 고향에 대한 슬픔을 노래한 일도 별로 없다.
남들은 향수(鄕愁)라는 말을 몹시 아름답게 쓰기도 하며 또 그 내용을 매우 풍부한 정서 속에 풀어놓기도 하나 나는 그런 것을 보거나 들을 때면 고향이라는 ‘향(鄕)’자를 슬며시 ‘향(香)’자로 바꾸어 향수(香愁)라는 한 어구(語句)를 만들어놓고 만다.
그래서 어쩌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나 어머니나 동생들이나 벗에게 가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 가는 대상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생각까지 난다.
이것은 지금 내가 자고 깨고 움직이는 곳이 그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워 그런 것이 아니고 고향이라는 곳이 나와 몹시 인연(因緣)이 먼 때문이다.
몇 해 살지는 않았어도 차라리 서울을 떠났으면 이것은 나의 마음과 정신이 하염없이 배회하던 곳이라 지극한 향수를 느낄 것도 같다.
어머니의 젖가슴 같기도 하고 에덴동산 같기도 한 이 그립고 정든 ‘향수’라는 것이 깃들지 못한 고향을 가졌다 함이 얼마나 행복치 못한 일인가.
더욱 고향이란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의 생활과 감정이 전적으로 의거(依據)되는 때가 있지 않은가.
Ⅱ
나의 현명한 할아버지가 내가 난 나의 고향에 처음 오셨을 때 이곳에는 큰 사람이 날 수 없다고 한 것은 여러 가지로 뜯어보고 캐어본 결론이겠지만 우선 3면에 산이 돌아앉었고 넓은 평야가 없어서 크게 내다볼 만한 곳이 없고 따라서 큰 마음이 의지할 만한 데가 없었던 소이(所以)인 것 같다.
산이래야 포옹성(抱擁性)도 없고 자만심(自慢心)도 없고 풍성한 데도 없어서 실상 귀한 새둥이 하나 칠 데 없는 산들뿐이다. 오직 하나의 영기(靈氣)를 가졌다면 동산대(東山臺)라는 용두형(龍頭形)일 것인데 이것조차 바다를 메우느라 과학의 신세(身勢)를 져서 화약(火藥) 냄새를 아직까지 피우고 있는 듯싶다.
봄에 꽃다웁지 못하고 여름에 녹음(綠陰)이 울창(鬱蒼)하지 못한데 가을의 빛같이 숙조(肅條)한 맛을 보여줄 리(理)가 없을 것이다.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진달래가 핀 봄날의 산골짜기도 있고 삼지구엽(三枝九葉)과 가람나무(떡갈나무의 함경도 사투리-편집자) 잎사귀가 누래가던 가을의 산록(山麓)도 있건마는 내가 고향을 떠난 지 오랜 탓인지 혹시 한 해에 한 번쯤 여름에 가서 초가을을 지내보아도 전과 같은 그러한 기분이라고는 나지 않고 그저 북쪽에서 한산(寒散)한 바람이 일찍부터 앙상하게 부는 것뿐이다.
“여기서는 큰사람이 나지 못한다…”
산에 소나무만이 서 있는 탓도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북쪽은 가을이라는 철이 몹시 짧아서 곧 겨울이 닥쳐온다는데도 그 이유가 있겠지만 어쩐지 가을이라는 인생과 자연이 크게 감격되고 영탄(永嘆)되고 성찰(省察)되는 계절적인 심후(深厚)한 멋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나의 고향의 풍토에 살아오는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지도 못하고, 크게 슬퍼하거나 크게 울지도 못하고 외래의 장사꾼들한테 모두를 빼앗기고 시들어버린다.
그럴듯한 전설이나 향그런 고담(古譚) 하나 바로 피어나지 못하고 아이들이 일찍 성인이 되어버리는 곳에서 나의 탄생에 놀라 할머니의 저고리를 거꾸로 입고 뛰어 일어나 나를 환영한 할아버지가 “여기서는 큰사람이 나지 못한다…” 한 것은 나의 고향의 운명이요, 30년이 지난 나 자신의 운명이 되고 말었다.
어느 때 나는 평양 대동강변을 거닐고 모란대(牧丹臺)에 올라서서 어느 친구에게 나도 어떤 자연에서 낳았더라면 좀 더 아름다울 수는 있었으리라고 말하여 그것이 슬프게도 소화(笑話)에 끝난 일이 있었지만 그것 역시 나 자신의 고향의 불명예이었다.
마침 나의 집이 앉은 위치가 관북(關北) 명산(名山)의 하나인 강릉산 높은 봉우리를 향하였으므로 가을이 되면 무엇보다도 이 산봉우리가 몹시 침점(沈點)된 사색(思索)에 머리를 파묻고 있는 듯함이 가장 좋은 운치를 이루었다.
Ⅲ
산들은 한쪽에 길따란—명사십리(明沙十里)보다도 더 긴 사원(沙原)을 끼고 동해바다를 안고 있다.
바다가 몹시 맑아서 우리는 물속을 들여다보면서 옛날에는 커다란 조개를 한 길씩 되는 바다 밑에서 자맥질하여 파내었다.
더욱 가을바람이 선들거리면 낚시질 꾼이 무척 많아서 나도 그들 속에 끼여서 바다의 가을바람이 흰 살결을 검푸르게 태운 일이 많었다.
기암과 괴석들이 바다 물결 위에 혹은 뜨고, 혹은 솟고, 혹은 내밀어서 이것만은 다른 곳에 비할 데 없이 나의 고향의 자랑거리도 되고 때로 수양(修養)거리도 되나 전면일대(前面一帶)에 출렁이는 이 맑고 푸른 바다가 여름철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는 고깃기름에 한결 덥혀진다.
더욱 가을이 되면 북선(北鮮) 경기(景氣)를 좌우하는 정어리라는 고기가 한정 없이 다산(多産)되야 바다와 땅과 사람이 한결같이 기름덩어리가 되어버리고 견딜 수 없는 그 냄새가 돈이라는 이명(異名)을 가지게 되며 촌 양반들까지도 거기에 와서는 “냄새가 고약하다”는 말을 함부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학문에 대한 출자(出資)까지라도 다분히 거기서 나왔고 또 촌닭과 계란과 과일과 모든 오곡이 나의 고향인 어촌의 자양(滋養)을 위하야 집중된다.
정어리가 나와 나의 고향의 사이를 무척 멀게 하여
고기를 운반하는 소발족이 기름에 탁탁 터지고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삼단같이 솟아날수록 거부들과 인부들의 한동안 말렸던 주머니에 기름먹은 십원짜리 지폐가 휴지같이 구겨져서 풍우(風雨)가 심하다든지 하야 쉬는 날만 되면 색가(色街)가 ○란 하야 공장주인님들이 들어앉을 자리를 어부와 인부들이 빼앗아 차지하고 있는 때가 많다.
심지어 소년들까지 이 흔한 돈을 한번 색가에 던져보고 싶어서 방앗간에 삼촌쯤 앉아 치정(痴情)을 부리면 뒷방에서 조카놈쯤 숨어서 소곤거리며 어린 계집의 술잔을 받아 마시기 일쑤다.
이 정취(情趣)에서 구제되기 어려운 지라 옛날 나의 할아버지께서 “여기서는 큰 사람이 못 나느니라” 하신 말씀이 이 바닷가의 후일을 두고 하신 예언이 되었으되 누구나 그 말씀을 기억치 못한다.
가을만 되면 수천황금이 왔다 갔다 하야 경상도 아가씨들을 처음으로 안내해드린 북선의 관문 청진(淸津), 나남(羅南)을 거쳐 들어오는 아가씨들은 모두 다 그 주인에게 수천황금을 벌어주어 그 주인으로 하여금 일추(一秋)에 유력자로 만들되 교육사업가와 유학생 수는 극히 적어서 전문(專門) 출신은 의례히 없고 중학 출신조차 희소하고 학교라는 것은 가난한 대로 지나간다.
정어리 하나로 이름을 대판(大阪), 신호(神戶)에 알린 갑자기 대산업도시의 발발(勃發) 흥(興)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그 도시에 서면 가을바람은 몹시 나를 슬퍼한다. 나같이 무용(無用)함이 없다 함을 설명하여주는 까닭인가 보다. 이렇게 보면 정어리가 나와 나의 고향의 사이를 무척 멀게 하여 놓았다. 우선 정어리 판에서는 내 살결과 손길은 저주(咀呪)받을 귀족(貴族)의 것이 되었다.
마음의 사정에 피치 못하야 슬금슬금 길게 완곡(婉曲)된 모래밭으로 향하면 거기는 이미 공장지대가 되었고 옛날 해당화는 간혹 보일 뿐 아름답던 한 조각 자연조차 도망질하여 멀리 산야(山野)로 기어나간 듯하다.
이리하야 질서 없이 급작스레 발달된 나의 고향은 자연을 쫓아낸 뒤 돈을 얻어 황폐하여졌다. 나의 눈은 볼 데가 없어서 탐탐하다. 보면 군색한 것뿐이다.
그래서 가을하늘을 바라보라던 사람들은 다 실패하야 어덴지 가버렸고 바다에서 꿈길을 찾으려던 사람들도 모두 다 바다를 등지고 없어졌다.
내가 친하던 얘기 잘하는 한 노인은 어느 해 가을 운명하기 며칠 전 어렸을 때의 마을이 그리워서 지팡이를 잡고 여기서 한숨 쉬고 저기서 눈물을 짓고 그다음 날 아무 후회도 없이 세상을 떠나갔다.
누구 하나 그를 추억하는 자도 없었고 거리에는 여전히 돈들만이 걸어 다니고 있었다.
사계의 변화가 세상에 지극한 우애(友愛)와 환성(歡聲)을 거느리고 왔다 갔거늘 나의 고향에는 그 의상(衣裳)의 정(情)과 색(色)이 크게 다르지 못하야 사람들은 몹시 순박하야 여름과 겨울을 가질 뿐에 그치는 것 같다.
이리하야 푸른 하늘과 바다가 깃들이고 있는 곳이면 꿈이 엉키리라 생각됨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현실이 있다.
가을이 되면 산업과 경제가 극히 건실한 나의 고향은 그 반면(反面)에 세계적 빈약과 불건실(不健實)을 차지하고 있어서 내가 여기서 나의 고향의 가을을 담당하야 쓰기에는 실상은 편집자의 상상이 너무 아름다웠던 듯하다. (끝)
(출처 《조광》 1938년 9월호)
추석 로맨스 ‘한가위’란 어떤 명절인가
이병기
 명절 가운데 가장 좋은 명절이 추석이외다.
명절 가운데 가장 좋은 명절이 추석이외다.
이때는 마침 곡식들이 풍성하게 익고, 과일들은 단맛이 들고 바람은 서늘하고 달은 밝습니다.
그리고 추석은 조선의 명절이외다. 조선에서는 이 명절을 다른 명절보다도 더 낫게 여기며 좋아하는 것이고, 이 명절에 대하여 재미스러운 이야기며 놀음, 놀이도 많이 있던 것이외다.
수수께끼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가위 하나를 사람마다 쓰는 것이 무엇이냐?
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8월 한가위’, 이것이 그 대답이외다.
음력 8월 15일을 ‘가위’ 또는 ‘가배’라고 말하는데, 가위라는 말은 마치 바느질에 쓰는 가위(가새)와도 같으므로 이렇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위라는 말은 어찌하여 생긴 것인가를 말하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900여 년 전 신라의 유리 임금 때입니다. 임금이 그때 여섯 부락을 정하고 부락의 여자들을 다시 두 편으로 나누어 임금의 따님 두 사람으로 하여 각각 그 한 편을 맡게 하여 편을 짜가지고 7월 16일부터 날마다 대궐 안에 모여 질쌈(길쌈의 경상도 방언. 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모든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편집자)을 하고 밤이 이윽하여(‘밤이 꽤 깊다’의 평안도 방언. 표준어는 이슥하다-편집자) 파하였습니다.
이러하여 8월 15일에 이르러서는 그 질쌈의 잘하고 못함을 상고하고, 진 편은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 사례하게 하며, 또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온갖 노래를 다 하게 하였는데, 이걸 곧 가위 또는 가배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마당에서 가난한 한 가난한 집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고 한탄하는 소리로 ‘회소, 회소’ 하였는데, 그 소리가 퍽이나 애처로워서 그 뒷사람이 그 소리로 하여 노래를 짓고 회소곡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음력 8월 15일을 ‘한가위’라고 함은 이러하거니와 이날을 또 추석이라 함은 그 뒤에 한문을 더 숭상하며 지어 부르던 것이외다. 추석은 물론 한문 그 뜻대로 ‘가을 저녁’이라는 것이지요만은, 가위라는 뜻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가위’의 ‘한’이라는 말은 ‘크다’는 말로써 지금도 ‘한글’ ‘한아버지’ 하야 쓰이는 말입니다.
회소곡이라는 노래도 지금은 전하지 않고 이조에 와서는 글 잘 쓰는 어른들이 한문으로 지은 회소곡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필재라는 이의 것을 대강 번역하여 드리면
회소 회소
바람 불고 달은 밝다.
공주와 6부 여자
함께 질쌈을 하네
네 광주리는 차고
내 광주리는 빈다
회소 회소
하는 이것이 얼만큼 그때 그 광경을 말하여주는 것이외다. 지금도 경상도 어느 지방에서는 추석과 같이 달이나 밝은 밤에 모여 유일을 하고 놀 때에는 서로들 “회소 회소” 하고 부르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의 유풍이나 아닌가 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이날 이러한 놀이가 있습니다.
달이 밝게 비치는 넓은 마당에 젊은 딸, 젊은 아들이 모여가지고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손목을 서로 잡고 삥 돌아 서서 여내 장단을 맞추어 발들을 움직이고 돌아다니며 또 노래도 부르는데 그 노래는,
대밭에는 대도 총총
강강수월래
하늘에는 별도 총총
강강수월래
꽃밭에는 꽃이 총총
강강수월래
하는 것이고 이러 하이 밤새는 줄도 모르고 신이 나서 논다 합니다.
한데 이 노래의 ‘강강술래’는 300여 년 전 임진란 때 처음 생긴 것이라고 하는 이가 있으나, 이 유희가 2000여 년 전 삼한 때부터 있었던 것인즉 그때부터 이 노래도 있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날 남자와 여자가 한데 모여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또 두 편을 갈라가지고 줄다리기를 하여 승부를 다투는데, 줄이 만일 중간에 끊어지든지 하면 두 편이 다 쓰러져 흩어지고 구경하는 이들은 손뼉을 치고 웃는다 하며 이걸 조리 놀이라고 한답니다.
또 경상남도 진주 같은 지방에서는 이날 소싸움을 시키는 놀이가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미리 돈을 많이 주고 싸움 잘하는 찌락박이 황소를 사두고 부리지 않고 잘 먹이어 그 기운을 돋우고 임시해서는 더 잘 먹이고 혹은 인삼탕 같은 걸 먹이기도 하여 추석날을 당하면 남강 사장 같은 넓은 들판으로 끌고 나가 싸움을 시킵니다.
이날은 이곳에서 남녀노소 몇만 명이 모여 구경을 하는데, 소도 또한 승기가 나서 저의 재주를 다 부리어 혹은 나아가고 혹은 물러나오다 마침내 한 놈이 견디지 못하여 탈이 나면 한 놈은 그 기운이 나서 쫓아갑니다.
이때 이 이긴 편에서는 징, 꽹과리, 북 등을 둥둥 울리며 뛰고 춤추고 좋아들 합니다.
이런 놀이 외에도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북어쾌, 젓조기, 신도주, 오려송편, 박나물, 토란국 따위의 음식을 장만하여 놓고
즐거운 자 오늘이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항상 오늘 같이다
하는 노래를 부르며, 배들을 불릴 대로 불리고, 사당패도 불러 놀리기도 하며, 제물을 차려 선산에 가 제도 지내며, 며느리는 말미를 얻어 색동저고리며 술병을 가지고 본집으로 근친도 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즐거워하는 이는 즐거워하지만은 슬퍼하는 이는 여간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쁨도 장안에서 남모르게 눈물을 지우는 것도 있고, 북망산 같은 무덤에도 풀을 뜯으며 목을 놓고 우는 이도 있습니다. 과연 조득운이라는 이의 시에도
과부 추석을 당하여
청산에 저물도록 운다
산밑에 익어가는 조를
같이 갈고는 같이 못 먹네
하는 것이 이러한 정경을 그려낸 것이외다.
이와 같이 즐겁든 슬프든 추석은 좋은 명절이외다. 조선의 좋은 명절이외다.
(출처 《조선중앙일보》 1934년 9월 22, 23일 4면)
곡(哭) 안익태(安益泰) 선생
박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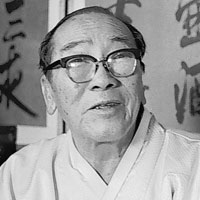 삼가
삼가
안익태 선생 영전(靈前)에 조사(吊辭)를 드리나이다.
지난 9월 17일 선생이 서반아(西班牙) 바르셀로나에서 돌연(突然) 별세(別世)하셨다는 구슬픈 음(音)을 듣고 우리들 모두는 지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 비만, 바다를 한 만리(萬里) 밖에서 다만 창공(蒼空)을 바라보며 선생의 온지(溫和)하셨던 용모(容貌)를 아로새겨 모시었을 뿐입니다.
이제 선생이 세상을 떠나신 후 49일을 당하여, 당신의 모국인 한국에서는 각계각층(各界各層)의 많은 인사들이 선생의 평생의 업적을 추모(追慕)하여 오늘 벅찬 슬픔을 가슴에 가득히 껴안고 선생의 영(靈)을 불러 흐느껴 울면서 두 손 모아 선생의 명복(冥福)을 비옵니다. 선생은 약관(弱冠) 때 이미 일본국립음악학교를 졸업하고 미주로 건너가 필라델피아 음악학교를 다시 졸업한 후에, 웅지(雄志)를 더 한번 펴서 유럽에 유학, 헝가리 국립음악학교에서 수학(修學)하신 후, 이듬해 1945년에는 서반아 ‘마요르카’ 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가 되시어 오늘날까지 20년 동안 무수한 세계교향악단의 지휘자가 되셨습니다.
이리하여 선생은 한국 음악인의 포부(抱負)를 높이고, 한국의 작곡가가 얼마나 우수한 역량(力量)을 가졌는가를 국제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더욱 선생을 존경하고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의 애국가를 새로 작곡하셨고, 민족 얼의 상징인 ‘논개(論介)’의 작곡입니다. 선생! 홀연(忽然)히 가시니 나이 60은 아직 이르지 아니합니까. 웬일이오니까, 너무나 허전하고, 쓸쓸하고 애달픕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천재교육을 위한 음악원을 설립하시려던 큰 포부는 누구한테 맡기고 가셨습니까. 국립교향악단을 구성하여 한국의 서양음악을 세계 수준에 도달시키겠다던 그 희망(希望)은 누구에게 전(傳)하고 가셨습니까.
이제, 음악의 국제적 지휘자였던 당신을 잃은 한국은 당신이 작곡한 명곡 ‘비창(悲愴)’ 그대로 비창 속에 빠져 있습니다. 슬프오이다. 당신은 비록 가셨다 하나 당신의 예술은 길이 한국과 및 세계에 영생(永生)해 있을 것입니다.
삼가 선생의 명복을 비옵니다.
1965년 11월
예술원회장 박종화
조(吊) 현제명(玄濟明) 박사
박종화
오늘 악단의 거성(巨星)인 현석(玄石) 현제명 박사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세상에서 마지막 영결(永訣)하는 이 자리에 임(臨)하여 우리들 모두는 박사의 생전에 끼쳐주신 크나큰 문화의 업적을 추모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가을바람 소슬한 속에 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만나면 반드시 별리(別離)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옵니다마는, 이렇게도 당신과의 이별이 속히 올 줄은 뜻밖의 일이었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만을 자아냅니다. 현석 박사! 당신은 건강했습니다. 예술에 불타오르는 뜨거운 정열과 함께 패기 가득한 위대한 정력가(精力家)였습니다.
당신의 뜨거운 예술의 정력과 태산도 굴복시킬 수 없는 굳센 의지(意志)는 마침내 한국 악단의 이룩하는 위대한 존재를 조형(造形)시켰던 것입니다.
돌연 병원에 입원했다는 염려되는 소식을 듣고 ‘장사(壯士)도 병(病)이 나오’ 하고 위문했더니 당신 몸은 여전히 건강한 얼굴로 빙긋 웃으며 소화가 좋지 않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어찌 이것이 영결의 빌미가 될 줄 알았으리까.
아아, 이제 우리는 쾌활한 당신의 말소리를 들을 수 없고 화려하게 웃는 당신의 얼굴을 대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의지할 수 없는 가족들, 의지할 수 없는 수많은 제자들의 할 수 없는 수많은 벗들 어찌하오리까. 그러나 우리들 모두 다 슬퍼하는 속에 당신은 가신 것이 아니라 문화사(文化史)상에 영생(永生)하셨습니다. 무(無)에서 유(有)를 갖게 하신 당신의 불멸의 큰 업적은 예술도 빛나고 사업도 찬연하옵니다. 약관 때부터 근 60에 이르기까지 40년에 뻗친 음악 생활은 이 나라 초창기의 교향악을 완성시켰고 콜롬비아 음반에 남겨둔 당신의 성악 예술은 천의무봉(天衣無縫)의 경지를 개척하였습니다. 더구나 ‘고향 생각’ 외 무수한 작곡과 〈춘향전〉 〈왕자 호동〉 등의 오페라 창작은 한국적 오페라를 처음으로 수립해놓은 크나큰 창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해방 이후 1년 동안 고심참담(苦心慘擔) 용왕매진(勇往邁進)하면서 음악 대학교를 형극(荊棘)의 길에서 창설하여 후진을 양성시키는 이 대사업은 당신의 음악 예술과 함께 영원히 빛날 금자탑을 세워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육체를 보내는 우리는 슬프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영생하여 우리의 주위에 빛나고 있습니다. 박사여, 명목(瞑目)하소서. 우리는 당신을 보내지 아니합니다.
단기 4293년(서기 1960년-편집자) 10월 20일
전시(戰時) 추석절 유감(有感)
신익희
 오늘은 음력으로 팔월이라 중추석 가배(嘉俳)의 명절이다. 2000년 전, 신라 시대의 이날은 길쌈을 장려하고 품평하는 날이었으나 그 후 세월이 흐르고 기대(幾代)의 왕조가 바뀌는 동안에 이날은 중추의 명절로서 즐기게 되어 산 사람은 새 옷을 입고 새 음식을 먹으며 죽은 이들을 생각하여서는 제사를 지낸다.
오늘은 음력으로 팔월이라 중추석 가배(嘉俳)의 명절이다. 2000년 전, 신라 시대의 이날은 길쌈을 장려하고 품평하는 날이었으나 그 후 세월이 흐르고 기대(幾代)의 왕조가 바뀌는 동안에 이날은 중추의 명절로서 즐기게 되어 산 사람은 새 옷을 입고 새 음식을 먹으며 죽은 이들을 생각하여서는 제사를 지낸다.
전란 중에 지내는 이 나라의 이날은 그 어떠할 것이냐? 그 본래의 뜻으로 보아서는 당연히 즐거움이 많고 슬픔이 적을 이날이언만은 실상으로는 얼마나 많은 슬픔이 이 나라 국민의 모든 가정에 차게 되었느냐,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이날의 송편 그릇을 앞에 놓고 그 떡이 목에 넘어가지 아니하여 눈물로써 그 송편을 적시리라. 남편을 잃은 청상(靑孀)들은 흰 옷에 흰 댕기를 들이고 산소에 가서 통곡하리라.
어떠한 예를 들어가면 집집마다 소장(素帳)을 늘인 상청(喪廳)이 놓였다 하니, 이것은 공비의 대량 학살로 생긴 비참한 자취이다. 얼마나 많은 상에서 통곡소리가 들리느냐? 6·25까지 평화스럽고 행복스럽던 가정이 공비에게 그 주인이 납치되어 고단(孤單)한 어머니의 연약한 팔로 수다한 자녀들을 벌어 먹이느라고 낮이나 밤이나 고생을 하면서 얼마나 북천(北天)을 바라보고 한숨지으랴.
다시 머리를 병원으로 돌릴 때에는 싸움에 부상한 후 고통에 못 이기어 창백하게 된 상이군인들의 얼굴이 나타난다. 그들의 장래를 어떻게 위안하고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 것이냐!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할 뿐이다.
전선에서는 추석날, 이 아침에도 여전히 쉬지 않고 전투가 벌어졌으리라. 중추의 밝은 달은 그들이 살던 고향의 초가집을 비추듯이 그들이 입고 있는 융의(戎衣)도 비추고 철투구도 비추리라. 구름도 쉬어 넘는 산악지대에서 싸움의 피곤으로 돌을 베고 풀을 깔고 누운 그들의 머리맡에도 가을의 귀뚜라미는 시름없이 울고 있으리라.
나의 머리에는 눈을 감고 있으면 이 나라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장면이 거대한 ‘파노라마’와도 같이 핑핑 돌고 있다
전선의 소식을 듣건대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해발 수천 척의 산악지대에서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싸우고 있다 한다.
철투구에 총검을 들고 험준한 산악을 비호같이 달리는 우리 애국 청년들의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 듯하다.
역사를 쓰는 거인(巨人)들아! 누가 그대들의 키가 작다 하여 왜소(矮小)하다고 하랴! 70개국의 젊은 영웅들은 저마다 그릇된 길로 가려는 인류사(人類史)의 길을 바로잡으려고 정의의 칼을 들고 전열(戰列)에 나선 것이다. 전 인류의 자유를 위하여 일찍이 한국을 지도로밖에 보지 않았던 세계 각국의 용사들은 한 전장에 모여 같은 목적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니, 이것은 바로 인류사가 있은 이래 최초의 시험이요, 또한 전사상(戰史上) 미증유(未曾有)의 일이다.
우리 병사들은 사라지려는 조국을 구하고 또는 무고(無辜)히 죽는 동포들을 구하는 동시에 이 위대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들의 눈은 거광(炬光)과 같이 번쩍인다. 그 번쩍이는 눈에서는 쉴 새 없이 정의의 광명이 흐르고 있다. 이 광명은 전 세계에 방사(放射)하여 모든 불의와 죄악을 불사르고 말리라.
인류가 있은 지 기만년(幾萬年)! 역사가 있은 지도 수천 년! 인류는 끊임없이 해방과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여 왔다. 그런데 현하의 공산전체주의는 경제적 평등이라는 허울 좋은 구실하에 전 세계의 자유를 또 한번 무서운 폭군의 쇠사슬로 옭아매려고 외람하게도 발악하면서 전 인류가 몇 세기 동안 피로 싸워 얻은 인간의 기본적 존엄에까지 도전하여 온 것이다.
생각건대 20세기 후반의 역사는 모든 사회상 평등과 함께 이 자유의 찬탈자(簒奪者)와 싸우는 것으로 차게 되리라. 그리하여 마침내는 정경대도(正逕大道)인 길로 바로잡으리라.
하늘은 어찌하여 한민족을 골랐는가?
한국 전선에서 전사한 유엔군 묘지에 가면 무수한 십자가의 아래에 누운 전 세계 각국의 용사들이 고요히 잠들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위하여 인생의 꽃인 청춘을 아낌도 없이 이 미국에 와서 바치고 영원한 잠에 들은 것이다. 추석절을 맞아 우리 동포들의 비통한 정경에 함께 울면서도 저들 전선에서 싸우는 용사! 그들의 눈에서 방사하는 정의의 등광(燈光)! 바로잡혀가는 인류사의 대도를 생각할 때에 나는 또 한 번 감개가 무량한 것이다.
우리 조국으로서나 전 세계의 정세로서나 완전한 승리까지는 아직도 기다(幾多)의 형극(荊棘)의 길이 앞에 놓였다. 그러나 ‘리프맨’의 지적과 같이 세계사의 앞에는 확실히 장미꽃 빛의 여명이 저 지평선상에 온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도 그 빛을 맞기 위하여 이 거대한 진통을 하는 것이다. 다만 그 대표적 희생을 하늘은 어찌하여 한민족을 골랐는가? 이론적이 아니라 감상적으로 슬퍼하고 또한 울게 됨은 우리 동포의 비참이 너무도 큰 데에 기막힌 때문이다. (1952년 9월 15일)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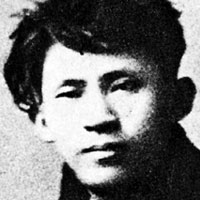 1년 360일, 그중의 몇 날을 추려 적당히 계절 맞춰 별러서 그날만은 조상을 추억하며 생의 즐거움에서 멀어진 지 오래된 그들 망령을 있다 치고 위로하는 풍속을 아름답다 아니할 수 없으리라. 이것을 굳이 뜻을 붙여 생각하자면 그날그날의 생의 향락 가운데서 때로는 사(死)의 적막을 가끔 상기해보며. 그러함으로써 생의 의의를 더한층 깊이 뜻있게 인식하도록 하는 선인들의 그윽한 의도에서 나온 수법이 아닐까?
1년 360일, 그중의 몇 날을 추려 적당히 계절 맞춰 별러서 그날만은 조상을 추억하며 생의 즐거움에서 멀어진 지 오래된 그들 망령을 있다 치고 위로하는 풍속을 아름답다 아니할 수 없으리라. 이것을 굳이 뜻을 붙여 생각하자면 그날그날의 생의 향락 가운데서 때로는 사(死)의 적막을 가끔 상기해보며. 그러함으로써 생의 의의를 더한층 깊이 뜻있게 인식하도록 하는 선인들의 그윽한 의도에서 나온 수법이 아닐까?이번 추석날 나는 돌아가신 삼촌 산소를 찾았다. 지난 한식날은 비가 와서 거기다 내 나태(懶怠)가 가하여 드디어 삼촌 산소에 가지 못했으니, 이번 추석에는 부디 가보아야겠고, 또 근래 이 삼촌이 지금껏 살아 계셨던들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적이 많아서 중년에 억울히 가신 삼촌을 한번 추억해보고도 싶고 한 마음에서 나는 미아리(彌阿里)행 버스를 타고 나갔던 것이다.
온 산이 희고 온 산이 곡성으로 하여 은은하다. 소조(蕭條)한 가을바람에 추초(秋草)가 나부끼는 가운데 분묘는 5년 전에 비하여 몇 배나 늘었다. 사람들은 나날이 저렇게들 죽어가는구나 생각하니 적이 비감(悲感)하다. 물론 5년 동안에 더 많은 애기가 탄생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렇게 날로날로 지상의 사람이 바뀐다는 것도 또한 슬픈 일이 아닌가?
다섯 번 조락(凋落)과 맹동(萌動)을 거듭한 삼촌 산소의 꽤 거친 모양을 바라보고 퍽 슬펐다. 시멘트로 땜질한 석상(石床)은 틈이 벌어졌고 친우 일동이 해 세운 석비(石碑)도 좀 기운 듯싶었다.
분토 한 곁에 앉아 잠시 생전의 삼촌의 그 중엄하기 짝이 없는 풍모를 추억해보았다. 그리고 운명하시던 날, 장사 지내던 날, 내가 제복 입었던 날들의 일, 이런 다섯 해 전 일들이 내 심안을 쓸쓸히 지나가는 것이었다.
나는 또 비명(碑銘)을 읽어보았다. 하였으되….
공렴정직(公廉正直) 신의우독(信義友篤)
금란결계(金蘭結契) 공동우락(共同憂樂)
중세최절(中世摧折) 사우감동(士友感動)
한산편석(寒山片石) 이표충정(以表衷情)
삼촌 구우(舊友) K씨의 작으로 내 붓 솜씨이다. 오늘 이 친우 일동이 세운 석비 앞에 주과(酒果)가 없는 석상이 보기에 한없이 쓸쓸하다.
그때 그 이웃 분묘에 사람이 왔다. 중노의 여인네가 한 분, 젊은 내외인 듯싶은 남녀, 10세 전후의 소학생이 하나, 네 사람이다. 젊은 남정네는 양복을 입었고, 젊은 여인네는 구두를 신었다. 중노의 여인네가 보퉁이를 열어 주를 갖춘 조촐한 제상을 차렸다. 그러고 향을 피우고 잔을 갈아 부으며 네 사람은 절한다.
양복 입은 젊은 내외의 하는 절이 더한층 슬프다. 그리고 교복 입은 학생의 하는 절은 너무나 애련하다. 중노의 여인네는 호곡한다. 호곡하며 일어날 줄을 모른다. 젊은 내외는 소리 없이 몇 번이나 향 피우고 잔 붓고 절하고 하더니 슬쩍 비켜섰다. 소학생도 따라 비켜섰다.
비켜서서 그들은 멀리 건너편 북망산(北邙山)을 손가락질도 하면서 잠시 담화하더니 돌아서서 언제까지라도 호곡하려 드는 어머니를 일으킨다. 그러나 좀처럼 일어나려 하지 않는다.
 |
| 《매일신보》 1936년 10월 16일 자 1면에 실린 이상 시인의 수필 〈추석 삽화(揷話)〉 |
이 광경을 바라보고 앉은 동안에 내 등 뒤에서 이 또한 중노의 여인네가 한 손자인 듯싶은 동자의 손을 이끌고 더듬더듬 내려왔다. 오면서 분묘 말뚝을 하나하나 자세히 조사한다. 필시 영감님의 산소 위치를 작년과도 너무 달라진 이 천지에서 그만 묘연히 잊어버린 것이리라.
이 두 사람은 이윽고 내 앞도 지나쳐 다시 돌아 그 이웃 언덕으로 올라간다. 그래도 좀처럼 “여기로구나” 하고 서지 않는다.
건너편 그 거만한 걸인은, 시비의 무득(無得)함을 깨달았던지, 제물을 단념하고 다시 다음 시주를 찾아서 간다.
걸인은 동쪽으로, 과부는 서쪽으로….
해는 이미 일반(日半)을 지났으니, 나는 또 삶의 여항(閭巷)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
‘코스모스’ 핀 언덕을 터벅터벅 내려오면서 그 과부는 영감님의 무덤을 찾았을까 걱정하면서 버스 곳까지 오니까 모퉁이 목로술집에서는 일장의 싸움이 벌어진 중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거상 입은 사람끼리다.
(출처 《매일신보》 1936년 10월 16일 자 1면)
| 이상(李箱·1912~1937년), 본명은 김해경(金海卿). 서울 출생. 보성고보, 경성공고 건축과 졸업. 1934년 9월 《조선중앙일보》에 시 ‘오감도’ 발표, 1936년 9월 《조광(朝光)》에 단편 〈날개〉를 발표했다. 소설 《봉별기》 《종생기》, 수필 〈권태〉 〈산촌여정〉 등이 있다. |
서울에 와서 (애상의 가을을 보냅니다)
김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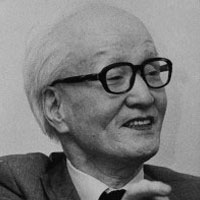 서울에 와서 수도가 다시 서울로 복귀된 뒤에 처음으로 서울에 오니 감회가 자못 무량(無量)하다. 작년 6월에 서울에 왔을 때에는 반공포로 석방 문제로 떠들썩하던 판이었고, 나이 어린 남녀 학생들이 가두로 ‘데모’ 행진을 하면서 북진통일(北進統一)을 부르짖었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 미군 철수 반대의 시위행진이 처처(處處)에 전개되어 지나간 1년간의 시국의 변천을 말하는 듯, 8·15해방 이후로 걸핏하면 가두로 뛰어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된 이 나라, 이 땅의 학도(學徒)들이 가엽기 짝이 없다.
서울에 와서 수도가 다시 서울로 복귀된 뒤에 처음으로 서울에 오니 감회가 자못 무량(無量)하다. 작년 6월에 서울에 왔을 때에는 반공포로 석방 문제로 떠들썩하던 판이었고, 나이 어린 남녀 학생들이 가두로 ‘데모’ 행진을 하면서 북진통일(北進統一)을 부르짖었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 미군 철수 반대의 시위행진이 처처(處處)에 전개되어 지나간 1년간의 시국의 변천을 말하는 듯, 8·15해방 이후로 걸핏하면 가두로 뛰어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된 이 나라, 이 땅의 학도(學徒)들이 가엽기 짝이 없다.나는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자라났다. 그리고 40 평생을 서울의 공기를 마시고 살아왔다. 말하자면 나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그리운 고향인 것이다. 이 같은 서울에 와서 내가 여관에서 숙식을 하게 될 줄이야 어찌 꿈엔들 상상이나 하였을까 보냐? 그야말로 객지 아닌 객지 생활을 하게 되니, 외롭고 쓸쓸한 생각과 함께 인생무상의 비애(悲哀)를 금할 수가 없다. 한양 한양조 500년의 옛 도읍이던 서울, 일제 치중(治中) 36년간에도 옛 모습을 그대로 고이 간직하여 온 서울이 6·25동란으로 이같이 깨어지고 부서질 줄은 참으로 몰랐었다.
일목일초(一木一草)가 정들지 않은 것이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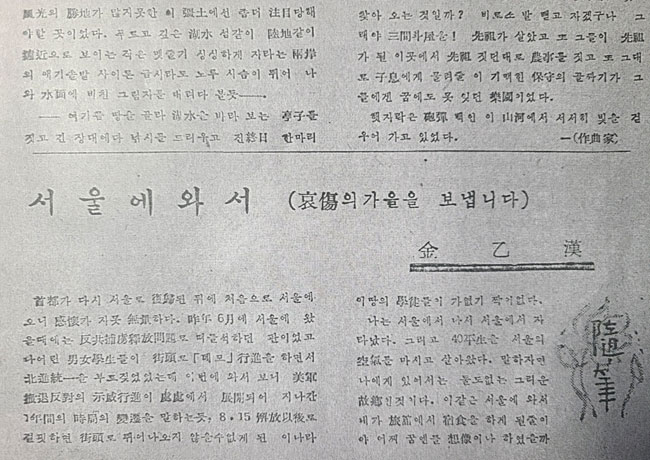 |
| 《새벽》 1954년 12월호에 실린 김을한의 글 〈서울에 와서〉. 글을 쓸 당시 《서울신문》 도쿄 특파원이었다. |
정든 고향을 파괴하고 피를 나눈 형제가 서로 죽이기 위해서 대망(待望)하여 온 8·15가 아닐진대, 운명의 장난도 너무나 악착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매일 틈만 있으면 이 거리 저 거리로 옛 터전을 찾아다니었다. 서울은 부산과 달라서 일목일초(一木一草)가 정들지 않은 것이 없고, 그리웁지 않은 것이 없다. 그만큼 가지가지 추억도 많으므로, 허물어진 집터에 서서 나 혼자서 눈물지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다만 북악산(北岳山)과 인왕산(仁旺山)과, 그리고 남산(南山)이 여전히 장안(長安)을 굽어보고 섰는 것은 다시없는 기쁨이었으나, 이미 서울에서는 볼 수 없게 된 수많은 선배와 친구를 생각하니 ○가 아프도록 마음이 슬프다. 무너진 건물은 다시 세우면 될 것이요, 소실(燒失)된 물자는 해외에서 구하여 오면 그만이다. 우리의 안계(眼界)에서 사라진 허다한 인재(人才)들은 다시 돌아올 기약(期約)이 없으니 이상(以上)의 손실이 또 어디 있을까 보냐?
뭐니 뭐니 하여도 6·25로 인한 최대의 손실은 좋은 사람, 훌륭한 일꾼들을 많이 잃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종로 YMCA를 찾아갔다.
붉은 벽돌로 지은 그 웅장한 4층 건물은 이미 볼 수가 없고 오직 한○, 1층 담벼락만이 남아 있어서 YMCA의 유적(遺跡)임을 말하고 있다. 붉은 담벼락 표면에는 흰 ‘뺑키(페인트-편집자)’로
‘1907년 와노 메카 씨(氏) 기증’
[당시 건물은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John Wanamaker·1838~1922년)의 4만 달러 쾌척과 각계각층의 위정자들과 시민, 독지가들의 후원을 통해 1907년 5월 중순부터 공사의 첫 삽을 뜰 수 있었다. 설계 감리는 돈함(B. C. Donham)이 맡았고, 공사는 헨리 장(Henry Chang)이라는 중국인이 맡았다.-편집자]
이라고 쓰여 있어 YMCA의 45년 역사를 표시하였고, 폐허가 된 내부의 판잣집 속에서는 귀여운 유치원 어린이들이 합창을 하고 있었는데 참으로 눈물겨웠다.
상전(桑田)이 벽해(碧海)가 된다 하더니 YMCA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줄이야 어찌 또 알았으랴. 난 어려서부터 YMCA를 무척 좋아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하였으니 30여 년간이나 YMCA의 신세를 진 셈이다. 원로 회원이 못 되어도 준(準)원로 회원쯤은 될 것이 틀림없다.
내가 ‘핑퐁(탁구)’을 치고 ‘바스켓볼’을 배운 것도 YMCA이고, ‘피아노’나 ‘바이올린’과 같은 서양 음악을 듣기 시작한 것도 YMCA요, 커피차(茶)나 ‘오트밀’을 처음 먹은 것도 YMCA이며, 근대식 연설이나 서(西)구라파의 신문, 잡지 등을 읽게 된 것도 모두 YMCA에서 배운 것이니, YMCA야말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신문화 수입의 원조였던 것이다.
YMCA만 가면 어쩐지 서양 냄새가 풍기고, 그 당시에는 보기 드물던 미국인을 용이하게 볼 수 있다는 매력이, 특히 소년시대의 내 마음을 이끈 것도 사실이지만, YMCA에는 우리 사회의 일류(一流) 인물들이 운집(雲集)해 있었음이 우리를,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끈 것도 또한 사실이었다.
그때에는 월남(月南) 이상재(李商在) 선생과 좌옹(佐翁) 윤치호(尹致昊) 선생께서 최고 지도자로 계셨는데, 태산(泰山)과 같이 위엄이 있고 우수하신 월남 선생과 총명하고도 영롱하신 좌옹 선생의 인자스러운 얼굴을 무시로 뵈옵는 것도 YMCA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행복이었다. 그다음으로는 신흥우(申興雨) 박사와 구자옥(具滋玉) 선생의 총무의 시대도 있었으나, 현재 생존하여 서울에 계신 분은 신 박사 단 한 사람뿐이다.
월남 선생의 제자로 좌옹 선생의 신임을 받아 그의 일생을 YMCA에서 봉사한 구자옥 선생은 애처롭게도 6·25 때 이북으로 납치된 채 우금(于今) 소식이 묘연하니, 평시에도 정신력으로 겨우 건강을 유지해오시던 구 선생이심에, 더구나 적지(敵地)에서 지금까지 생명을 보존하고 계실까는 크나 큰 의문인 것이다. 나에게는 권력도 없고, 재력도 없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를 뫼시고, 사회에 나가서는 다시 만나기 어려운 일대(一代)의 위인(偉人)들을 알게 되어, 또 그분들의 신뢰와 총애를 받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큰 행복으로 생각한다. 지금도 나에게는 좋은 선배와 훌륭한 친우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행복을 어찌 비속(卑俗)된 권력이나 재력에다 비할까 보냐? 연고로 나의 마음은 항상 명랑하고, 이미 유명(幽明)을 달리하게 된 허다한 인물들을 한 번 대해보지도 못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엾게도 생각이 든다.
구자욱 선생도 나를 가장 이해하고 사랑해준 분의 한 사람인데, 60 평생을 YMCA에서 늙었고, 해방 후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에 납치된 채 소식을 모르니 애석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는 외유내강(外柔內剛)한 분으로, 나와의 30년 교유(交遊) 중 단 한 번도 눈살을 찌푸려본 일이 없으며, 청렴 강직한 점으로는 첫손가락을 꼽을 만하고 성정(性情)이 고운 양심적인 선배였다. YMCA의 ○○에 서서 이일저일 왕사(往事)를 회고(回顧)하니 만감이 교차하여 가슴이 막히는 듯 나는 한참 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다. 6·25 때 나는 허다한 친지를 잃어버렸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죽은 아기가 더 귀여운 심리일지 몰라도 납치되고 실종된 인사치고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구자옥, 양주삼(梁柱三), 김춘기(金春基), 정인익(鄭寅翼), 이정수(李貞洙), 김형원(金炯元), 마태영(馬泰榮), 이의식(李義植), 김사연(金思演), 김익동(金益東)씨 등은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는 분들이다. 모두 다 나와는 수십 년간 교분 있는 사람들로서, 특히 염파(念坡) 정인익 형은 친형제나 다름없이 자별하게 지내온 만큼 더욱 마음이 거리낀다. 6·25 당시 나는 관수동에, 염파 형은 돈의동에 숨어 지냈는데 7월 초순 어느 날 저녁에 그는 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서울은 위험하니 시급히 서울을 떠나라’는 기별을 하였다.
그것은 염파를 찾아온 어떤 공산당원의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김모가 발견되면 무사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놀래어서 나에게 급보를 전한 것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탈출할 궁리를 하고 있던 터인데, 그 말을 듣고 보니, 더구나 서울에 있기가 싫어서 나는 부랴부랴 짐을 꾸려가지고 바로 그 이튿날 시골로 떠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는 것이 나는 비록 구사일생(九死一生)이나마 잔명(殘命)을 보존하였건만 정작 염파는 9·28 직전에 이북으로 끌려갔으니 사람의 운명(運命)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다.
인격으로나 견식(見識)으로나 또한 덕망으로나 조고계(操觚界·문필 종사자의 사회-편집자)의 제1인자였던 그를 잃은 것은 우리 언론계의 일대(一大)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염파는 과연 살았는지 죽었는지 사생을 같이하자던 친지가 없어진 서울은 어딘가 텅 빈 것 같다.
서울은 나의 고향이다. 내가 나고 자란 곳이다. 그러나 서울은 벌써 예전의 서울이 아니다. 삼라만상이 다 변한 듯 모든 것이 눈 설고 애처롭게 느껴지며, 사람들조차 딴사람같이 보여진다.
다만 한 가지 변화하지 않는 것은 오늘도 어제와 같이 차세대의 젊은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고, 아침이면 학교에 가는 남녀 학생들이, 학도들이 거리에 충만한 것이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평소부터 존경하고 있던 정계의 요인 R씨를 찾아갔더니 그는 나를 보고
“우리나라의 형편은 여러 가지가 참으로 곤란하지만 매일 아침에 거리에 나가 보면 새로운 용기가 납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느라고 분주하게 다니는 광경을 보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말에 난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 젊은이들을 다시 사지(死地)에 넣지 않고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그것은 나이 먹은 사람들의 책임이 아닐까요?”
나는 지금 ‘객지(客地) 아닌 객지’에서 애상(哀傷)의 가을을 보고 있다.
-1954년 10월 15일-
(在동경 유엔군기자구락부원)
(출처 《새벽》 1954년 12월호)
| 김을한(金乙漢·1906~1992년). 아호는 동명(東溟). 서울 출생. 양정고보, 와세다대 졸업. 김기진 등과 극단 토월회에 관여했다. 《조선일보》 《매일신보》 《만몽일보(滿蒙日報)》 《서울신문》 《재일한국신문》 등에서 기자, 발행인 등으로 활동했다. 언론인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 저서와 이상재(李商在)·윤치호(尹致昊) 등 근대 인물들의 전기를 여러 권 남겼다. |
모종신범(暮鍾晨梵)의 무아경(無我境)
한용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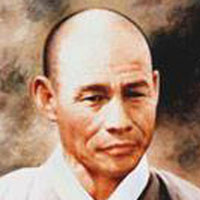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그것은 무슨 습관이나 제도로서가 아니라, 자연과 인사(人事)가 독서에 적의(適宜)하게 되는 까닭이다. 자연으로는 긴 여름의 괴로운 더위를 지나서 맑은 기운과 서늘한 바람이 비롯는 때요, 인사로는 자연의 그것을 따라서 백사앙장(百事鞅掌·매우 바쁘고 번거로움-편집자)한 여름 동안에 땀을 흘려가며 헐떡이던 정신과 육체가 적이 가쁘고 피곤한 것을 거두고 조금 편안하고 새로운 지경으로 돌쳐서게 되는 까닭이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그것은 무슨 습관이나 제도로서가 아니라, 자연과 인사(人事)가 독서에 적의(適宜)하게 되는 까닭이다. 자연으로는 긴 여름의 괴로운 더위를 지나서 맑은 기운과 서늘한 바람이 비롯는 때요, 인사로는 자연의 그것을 따라서 백사앙장(百事鞅掌·매우 바쁘고 번거로움-편집자)한 여름 동안에 땀을 흘려가며 헐떡이던 정신과 육체가 적이 가쁘고 피곤한 것을 거두고 조금 편안하고 새로운 지경으로 돌쳐서게 되는 까닭이다.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 하지마는 낮보다도 밤을 이름이니, ‘추야장(秋夜長)’이라면 자연히 독서와 회인(懷人)을 연상(聯想)하게 되는 것이다. 독서라는 것은 문자 전공하는 사람의 일뿐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아니할 수 없는 집무(執務)를 하여 가면서 틈틈이 하게 되나니, ‘낮에 밭 갈고 밤에 글 읽는다’는 말이 특히 그러한 뜻을 대표할 만한 말이다.
그러나 나는 일생을 통하여 집무 때문에 독서를 할 만한 시간은 흔히 적었다. 그리하여,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피로를 못 견딘다든지 하는 때가 별로 없어서, 가을이 아니라도 또는 밤이 아니라도 글을 읽을 만한 시간과 경우를 많이 가졌었지마는, 그것의 대부분을 무위방랑(無爲放浪)에 소비하고 독서에 제공한 시간은 극히 적었다.
더우기 근년에는 독서가 거의 절무(絶無)하다고 할 수가 있으니, 그것은 게으른 것도 한 원인이지마는, 의식적으로 별로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까닭이다. 그것은 ‘인생’이란 것을 독서 이외에서 찾아보려는 의도이다. 그러고 보면, 설문한 ‘독서삼매경’이라는 것을 대답하기는 불가능이다. 하기야 석일(昔日)의 회상을 들추어본다면, 그대로 적을 만한 것이 그다지 없지도 아니하겠지마는, 지금 의식적으로까지 독서를 잘 않는 사람으로 독서에 대한 과거의 낙사진[落謝塵, 현재의 법(法)이 그 작용을 그치고 과거로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불교용어-편집자]을 들춘다는 것이 별로 재미있는 일이 못 되는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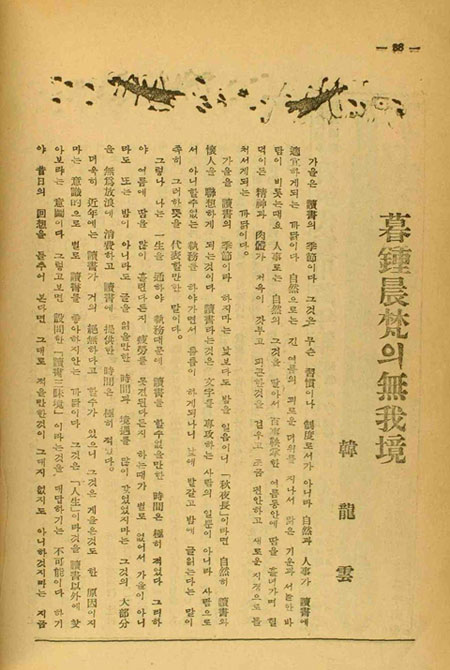 |
| 한용운의 〈모종신범의 무아경〉은 《조광》 1936년 10월호에서 찾을 수 있다. |
‘아유일권경(我有一卷經) 불인지묵성(不因紙墨成) 전개무일자(展開無一字) 상방대광명(常放大光明).’(나에게 한 권의 경이 있는데 그것은 종이나 먹으로 된 게 아니다. 종이나 먹으로 된 게 아니므로 펼쳐보아야 글자 하나 없지만 항상 광명을 놓고 있더라-편집자)
이것이 나의 독서신법(新法)이다. 나는 가을을 맞이하자,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모종신범(暮鐘晨梵)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거니와, 기왕 삼매경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흔히 ‘혼침도격[昏沈掉擊·정신이 혼미하고 들뜬 상태. 다른 불교서적에는 도거(掉擧)로 표현되어 있다.-편집자]’의 교란(攪亂)을 받는다. 언제나, 모든 망상을 제거하고 나의 독서법을 완성할는지 답답한 일이다.
(출처 《조광》 1936년 10월호)
| 한용운(韓龍雲·1879~1944년). 승려·시인·독립운동가. 법호는 만해(萬海, 卍海). 충청남도 홍성 출신. 1926년 한국 근대시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인정받는 대표적 시집 《님의 침묵》을 발간했다. 논저 《조선불교유신론》 《불교대전(佛敎大典)》 《채근담(菜根譚)》 주해본을 펴냈다. |
만월대(滿月臺)의 가을
이태준
| [편집자 註] 경기도 개성시 송악산(松嶽山)에 있는 고려 시대의 궁궐터. 919년(태조 2년) 정월에 태조가 송악산 남쪽 기슭에 도읍을 정하고 궁궐을 창건한 이래 1361년(공민왕 10년) 홍건적의 침입으로 소실될 때까지 고려왕의 주된 거처였다. 동서 445m, 남북 150m 정도의 대지에 위치한 왕궁터의 가운데에는 정사를 처리하는 정전(正殿)인 회경전(會慶殿)이 위치하였다. |
 개성서 ‘가을 글’을 써 보내라 하니 개성서 만월대의 가을을 거닐던 생각이 나오.
개성서 ‘가을 글’을 써 보내라 하니 개성서 만월대의 가을을 거닐던 생각이 나오.나는 한동안 개성에 자주 다니었소. 가을엔 처가에 가는 것보다 만월대에 오르기가 더 급(急)하여서 짐만 없으면 만월대로 바로 가기도 여러 번 있었소.
만월대는 처가에 비기면 매우 쓸쓸한 곳이었소. 반가이 맞아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소. 그러나 나에겐 처가만 못하지 않게 그의 품에 안기기가 낙이었소.
사람의 손자리는 사라져 고석(古石)이 된 주춧돌이며 산(山)마루와 같이 지나는 바람에 마른 풀잎들만 우는 덩그렇니 비인 터전들, 그 마당에서 벌레들을 밟으며 거닐 때 나는 정말이지 불타 없어진 왕씨(王氏)네의 궐우(闕宇)가 보고 싶던 않았소. 그렇게 텅 비인 터전만 남은 것이 좀 먹은 누각들이 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음속에 사무치는 것이 컸소. 허(虛)란 실(實)보다 더욱 위대한 존재임을 만월대를 거닐며 느끼곤 했소.
어디라고 가을치고 마른 풀이 없겠소. 어디라고 가을치고 벌레소리가 없겠소. 그러나 만월대의 풀과 벌레들은 슬픈 노래의 선수들 같았소. 어디라고 폐허(廢墟)가 없고, 어디라고 풍월(風月)이 없겠소. 그러나 만월대의 그것들은 인생의 슬픈 이야기 책의 삽화(揷畫)들이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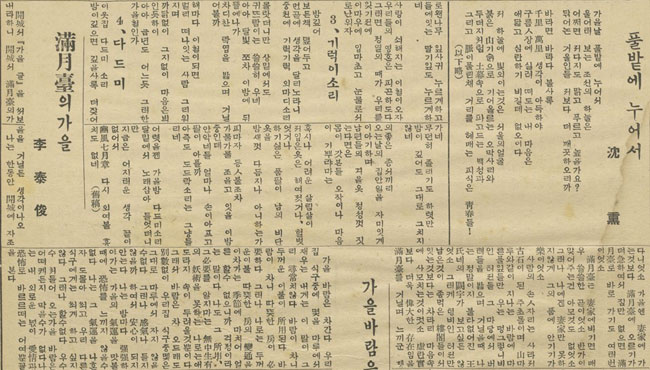 |
| 월북작가 이태준이 쓴 〈만월대(滿月臺)의 가을〉. 《고려시보》 1933년 10월 1일 자 8면에 실렸다. |
행여 고려의 궁(宮)터라 이르지 마오. 만월대의 주인은 고려는 아니오. 거기서 해마다 솟아나는 이름 없는 풀들도 아니요, 지나고 지나고 그칠 줄 모르는 달이며 바람이며 모다 그의 주인은 아니오.
요즘과 같은 가을날 한때 고요히 겸허(謙虛)한 마음으로 올라보시오. 만월대의 주인은 적막(寂寞)이오.
이 전 처가는 없어졌어도 만월대의 가을을 거닐러 한번 개성에 가고 싶소.
(출처 《고려시보》 1933년 10월 1일 자 8면)
| 이태준(李奎泰·1904~1978년). 아호는 상허(尙虛), 상허당주인(尙虛堂主人). 휘문고 중퇴, 조치대 중퇴. 소설의 완성도가 높아 ‘조선의 모파상’이라 불렸다. 주요 작품으로 《오몽녀》 《복덕방》 《가마귀》, 수필집으로 《무서록(無序錄)》 《문장강화(文章講話)》 등이 있다. 1946년 월북했다. |
나와 가을과 고향
손소희
 먼 먼 고향의 가을 하늘… 나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그 하얀 길 위를 달달달 굴러가는 소술기(술기는 ‘수레’의 함경도 방언-편집자) 위에 앉아, 저무는 가을을 마음으로 거두어야 했다.
먼 먼 고향의 가을 하늘… 나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그 하얀 길 위를 달달달 굴러가는 소술기(술기는 ‘수레’의 함경도 방언-편집자) 위에 앉아, 저무는 가을을 마음으로 거두어야 했다.왼편으로는 나지막한 산들이 병풍같이 둘러져 있고, 남쪽으로는 버들 방축, 저편으로는 하얀 모래밭과 맑은 시내가 흐르고 있다.
산 둘레는 붉고 누르게 단풍이 진 나무 잎사귀와 푸른 소나무로 빽빽이 차 있다. 그 속에는 새빨간 질그배[산사(山査)나무-편집자]와 노란빛 가얌(개암-편집자)과 갈색 도토리와 향기 높은 돌배와 이러한 것들로 차 있는 다람쥐 굴이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깊은 산골엔 그러한 것으로 그득히 차 있다는 곰의 굴도 있다는 것이다.
그 곰의 굴 안에 있는 새빨간 질그배는 사탕모양 입안에서 녹아나고, 노란빛 가얌은 깨강정보다 열 배나 고수하고, 갈색 도토리는 달고 노글노글한 엿 같으며, 향기 높은 돌배는 꿀이 왔다가 울고 갈 정도로 별미(別味)라는 것이다.
이것들은 몬테크리스트의 보석(寶石)의 동굴과도 같이 호기심으로 어린 가슴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이야기 거리기도 하였다.
달달달 굴러가는 소술기 위에서 나는 그러한 이야기 속을 더듬고 있었다.
그러나 눈앞과 그 주변에는 볏단을 쌓아 올린 볏무지와 벼를 잘라낸 그루터기들이 단조(單調)로운 무수한 무늬와 같이 끝없이 땅 위에 돋아 있을 뿐이다.
문득 저 멀리 길의 맞은 켠 쪽으로부터 벼낟가리 같은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드디어 길 밖으로 나온다. 산더미같이 벼를 실은 소술기인 것이다. 소술기는 이쪽을 향해 덜거덕 덜거덕 굴러온다. 내가 탄 소술기는 달달달 저쪽을 향해 굴러간다. 그 앞에는 거꾸로 박힌 눈과 푸른 수염을 단 도깨비 왕이 어깨를 살려가지고 팔을 드리운 듯한 천하 대장군지문(天下 大將軍之門)이 있다. 벼를 실은 소술기는 그사이 그 문을 빠져나오더니,
“아아, 자넨가? 어떻게 거의 끝나나?”
“끝나는 게 다 뭐야? 앞으로두 닷새는 더 걸려야 할까 보이. 자네네는 어때? 끝나가나?”
하는 머슴들의 느리고 굵은 악센트가 들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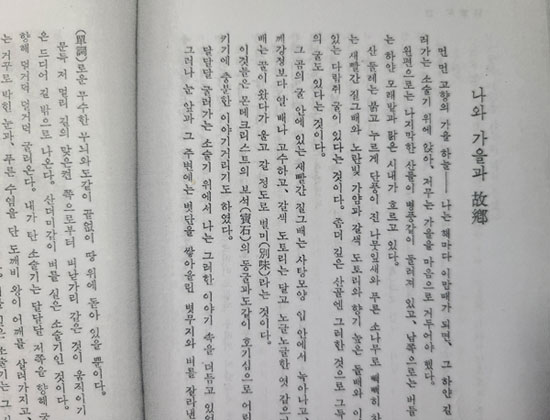 |
| 《한국여류수필전집》(1965)에 실린 손소희의 에세이 〈나와 가을과 고향〉. |
“아니, 그런데 젖먹이(막내) 색씨(아가씨)는 왜?” 한다.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벼 심으러 가는 소술기에 왜 앉아 가느냐 하는 뜻이다. 우리 집 머슴이 나를 돌아다보고 씩 웃는다. 누우런 이빨이다. 나는 못 본 체 주저앉아서 바른편 눈꼬리로 흘러드는 하얀 구름은 어디까지 가는 걸까, 구름은 떠가는 것이 재미나는 모양인가, 집은 어딜까, 이런 따위 생각도 하고, 재수가 좋으면 논두렁의 말라든 풀 덩굴 속에서 빨간 꽈리를 가지고 멋지게 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눈을 깜빡여도 본다.
한편 걸어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섬찟해지기도 한다. 잔뜩 벼를 실은 술기 뒤를 따라 큰길로 타박타박 걷는다는 것은 멀고 지루한 일이다. 그래서 샛길로 빠져들 생각을 한다. 샛길이란 추수를 끝낸 논바닥을 이용하는 것이다.
논바닥에는 벼 그루터기들이 옹기종기 돋아 있다. 옹기종기 돋아 있는 벼 그루터기를 한 걸음에 세 낱씩 건너 밟는다면 심심치 않거니와, 빨리 걸을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생각도 한다. 예를 써서 벼 실려가는 빈 소술기에 앉아 호사를 하면서도, 은근히는 이렇게 걸어 돌아올 길이 걱정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옛이야기다.
그러나 지금도 가을철이 돌아올 때마다 나를 고향으로 이끄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금 그때의 그 느리고 굵은 악센트의 머슴들은 아직도 그 하얀 길 위로 그렇게 소술기를 몰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출처 《한국여류수필전집》(상하권), 1965, 국제문화사)
| 손소희(孫素熙·1917~1986년), 함북 경성 출생. 함흥 영생고보, 니혼대 중퇴, 한국외대 졸업. 1949년 전숙희(田淑禧)·조경희(趙敬姬) 등과 종합지 《혜성(慧星)》을 발간하여 주간을 임했다. 1950년 6·25로 중단되었다. 주요 작품으로 《이라기(梨羅記)》 《창포 필 무렵》 《고원(古苑)의 봄》 등 다수다. |
나와 고향과 가을
김광섭
 Ⅰ
Ⅰ글을 써온 지 7~8년 되었고 시(詩)에 붓을 대인지 몇 해 되었어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말한 일도 없고 고향에 대한 슬픔을 노래한 일도 별로 없다.
남들은 향수(鄕愁)라는 말을 몹시 아름답게 쓰기도 하며 또 그 내용을 매우 풍부한 정서 속에 풀어놓기도 하나 나는 그런 것을 보거나 들을 때면 고향이라는 ‘향(鄕)’자를 슬며시 ‘향(香)’자로 바꾸어 향수(香愁)라는 한 어구(語句)를 만들어놓고 만다.
그래서 어쩌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나 어머니나 동생들이나 벗에게 가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 가는 대상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생각까지 난다.
이것은 지금 내가 자고 깨고 움직이는 곳이 그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워 그런 것이 아니고 고향이라는 곳이 나와 몹시 인연(因緣)이 먼 때문이다.
몇 해 살지는 않았어도 차라리 서울을 떠났으면 이것은 나의 마음과 정신이 하염없이 배회하던 곳이라 지극한 향수를 느낄 것도 같다.
어머니의 젖가슴 같기도 하고 에덴동산 같기도 한 이 그립고 정든 ‘향수’라는 것이 깃들지 못한 고향을 가졌다 함이 얼마나 행복치 못한 일인가.
더욱 고향이란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의 생활과 감정이 전적으로 의거(依據)되는 때가 있지 않은가.
Ⅱ
나의 현명한 할아버지가 내가 난 나의 고향에 처음 오셨을 때 이곳에는 큰 사람이 날 수 없다고 한 것은 여러 가지로 뜯어보고 캐어본 결론이겠지만 우선 3면에 산이 돌아앉었고 넓은 평야가 없어서 크게 내다볼 만한 곳이 없고 따라서 큰 마음이 의지할 만한 데가 없었던 소이(所以)인 것 같다.
산이래야 포옹성(抱擁性)도 없고 자만심(自慢心)도 없고 풍성한 데도 없어서 실상 귀한 새둥이 하나 칠 데 없는 산들뿐이다. 오직 하나의 영기(靈氣)를 가졌다면 동산대(東山臺)라는 용두형(龍頭形)일 것인데 이것조차 바다를 메우느라 과학의 신세(身勢)를 져서 화약(火藥) 냄새를 아직까지 피우고 있는 듯싶다.
봄에 꽃다웁지 못하고 여름에 녹음(綠陰)이 울창(鬱蒼)하지 못한데 가을의 빛같이 숙조(肅條)한 맛을 보여줄 리(理)가 없을 것이다.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진달래가 핀 봄날의 산골짜기도 있고 삼지구엽(三枝九葉)과 가람나무(떡갈나무의 함경도 사투리-편집자) 잎사귀가 누래가던 가을의 산록(山麓)도 있건마는 내가 고향을 떠난 지 오랜 탓인지 혹시 한 해에 한 번쯤 여름에 가서 초가을을 지내보아도 전과 같은 그러한 기분이라고는 나지 않고 그저 북쪽에서 한산(寒散)한 바람이 일찍부터 앙상하게 부는 것뿐이다.
“여기서는 큰사람이 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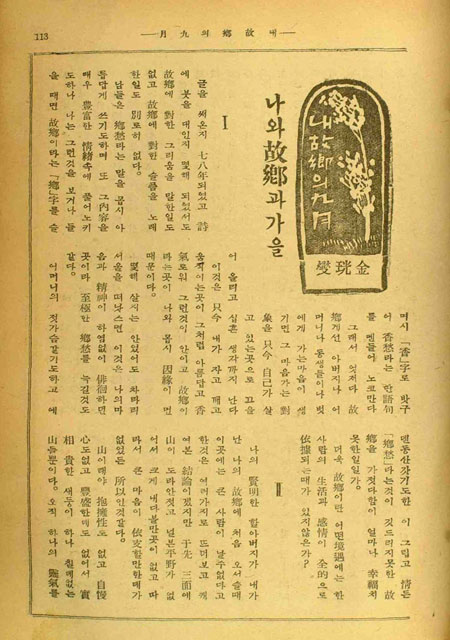 |
| 김광섭 시인의 에세이 〈나의 고향과 가을〉. 《조광》 1938년 9월호에 게재되었다. |
그래서 그런지 나의 고향의 풍토에 살아오는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지도 못하고, 크게 슬퍼하거나 크게 울지도 못하고 외래의 장사꾼들한테 모두를 빼앗기고 시들어버린다.
그럴듯한 전설이나 향그런 고담(古譚) 하나 바로 피어나지 못하고 아이들이 일찍 성인이 되어버리는 곳에서 나의 탄생에 놀라 할머니의 저고리를 거꾸로 입고 뛰어 일어나 나를 환영한 할아버지가 “여기서는 큰사람이 나지 못한다…” 한 것은 나의 고향의 운명이요, 30년이 지난 나 자신의 운명이 되고 말었다.
어느 때 나는 평양 대동강변을 거닐고 모란대(牧丹臺)에 올라서서 어느 친구에게 나도 어떤 자연에서 낳았더라면 좀 더 아름다울 수는 있었으리라고 말하여 그것이 슬프게도 소화(笑話)에 끝난 일이 있었지만 그것 역시 나 자신의 고향의 불명예이었다.
마침 나의 집이 앉은 위치가 관북(關北) 명산(名山)의 하나인 강릉산 높은 봉우리를 향하였으므로 가을이 되면 무엇보다도 이 산봉우리가 몹시 침점(沈點)된 사색(思索)에 머리를 파묻고 있는 듯함이 가장 좋은 운치를 이루었다.
Ⅲ
산들은 한쪽에 길따란—명사십리(明沙十里)보다도 더 긴 사원(沙原)을 끼고 동해바다를 안고 있다.
바다가 몹시 맑아서 우리는 물속을 들여다보면서 옛날에는 커다란 조개를 한 길씩 되는 바다 밑에서 자맥질하여 파내었다.
더욱 가을바람이 선들거리면 낚시질 꾼이 무척 많아서 나도 그들 속에 끼여서 바다의 가을바람이 흰 살결을 검푸르게 태운 일이 많었다.
기암과 괴석들이 바다 물결 위에 혹은 뜨고, 혹은 솟고, 혹은 내밀어서 이것만은 다른 곳에 비할 데 없이 나의 고향의 자랑거리도 되고 때로 수양(修養)거리도 되나 전면일대(前面一帶)에 출렁이는 이 맑고 푸른 바다가 여름철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는 고깃기름에 한결 덥혀진다.
더욱 가을이 되면 북선(北鮮) 경기(景氣)를 좌우하는 정어리라는 고기가 한정 없이 다산(多産)되야 바다와 땅과 사람이 한결같이 기름덩어리가 되어버리고 견딜 수 없는 그 냄새가 돈이라는 이명(異名)을 가지게 되며 촌 양반들까지도 거기에 와서는 “냄새가 고약하다”는 말을 함부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학문에 대한 출자(出資)까지라도 다분히 거기서 나왔고 또 촌닭과 계란과 과일과 모든 오곡이 나의 고향인 어촌의 자양(滋養)을 위하야 집중된다.
정어리가 나와 나의 고향의 사이를 무척 멀게 하여
고기를 운반하는 소발족이 기름에 탁탁 터지고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삼단같이 솟아날수록 거부들과 인부들의 한동안 말렸던 주머니에 기름먹은 십원짜리 지폐가 휴지같이 구겨져서 풍우(風雨)가 심하다든지 하야 쉬는 날만 되면 색가(色街)가 ○란 하야 공장주인님들이 들어앉을 자리를 어부와 인부들이 빼앗아 차지하고 있는 때가 많다.
심지어 소년들까지 이 흔한 돈을 한번 색가에 던져보고 싶어서 방앗간에 삼촌쯤 앉아 치정(痴情)을 부리면 뒷방에서 조카놈쯤 숨어서 소곤거리며 어린 계집의 술잔을 받아 마시기 일쑤다.
이 정취(情趣)에서 구제되기 어려운 지라 옛날 나의 할아버지께서 “여기서는 큰 사람이 못 나느니라” 하신 말씀이 이 바닷가의 후일을 두고 하신 예언이 되었으되 누구나 그 말씀을 기억치 못한다.
가을만 되면 수천황금이 왔다 갔다 하야 경상도 아가씨들을 처음으로 안내해드린 북선의 관문 청진(淸津), 나남(羅南)을 거쳐 들어오는 아가씨들은 모두 다 그 주인에게 수천황금을 벌어주어 그 주인으로 하여금 일추(一秋)에 유력자로 만들되 교육사업가와 유학생 수는 극히 적어서 전문(專門) 출신은 의례히 없고 중학 출신조차 희소하고 학교라는 것은 가난한 대로 지나간다.
정어리 하나로 이름을 대판(大阪), 신호(神戶)에 알린 갑자기 대산업도시의 발발(勃發) 흥(興)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그 도시에 서면 가을바람은 몹시 나를 슬퍼한다. 나같이 무용(無用)함이 없다 함을 설명하여주는 까닭인가 보다. 이렇게 보면 정어리가 나와 나의 고향의 사이를 무척 멀게 하여 놓았다. 우선 정어리 판에서는 내 살결과 손길은 저주(咀呪)받을 귀족(貴族)의 것이 되었다.
마음의 사정에 피치 못하야 슬금슬금 길게 완곡(婉曲)된 모래밭으로 향하면 거기는 이미 공장지대가 되었고 옛날 해당화는 간혹 보일 뿐 아름답던 한 조각 자연조차 도망질하여 멀리 산야(山野)로 기어나간 듯하다.
이리하야 질서 없이 급작스레 발달된 나의 고향은 자연을 쫓아낸 뒤 돈을 얻어 황폐하여졌다. 나의 눈은 볼 데가 없어서 탐탐하다. 보면 군색한 것뿐이다.
그래서 가을하늘을 바라보라던 사람들은 다 실패하야 어덴지 가버렸고 바다에서 꿈길을 찾으려던 사람들도 모두 다 바다를 등지고 없어졌다.
내가 친하던 얘기 잘하는 한 노인은 어느 해 가을 운명하기 며칠 전 어렸을 때의 마을이 그리워서 지팡이를 잡고 여기서 한숨 쉬고 저기서 눈물을 짓고 그다음 날 아무 후회도 없이 세상을 떠나갔다.
누구 하나 그를 추억하는 자도 없었고 거리에는 여전히 돈들만이 걸어 다니고 있었다.
사계의 변화가 세상에 지극한 우애(友愛)와 환성(歡聲)을 거느리고 왔다 갔거늘 나의 고향에는 그 의상(衣裳)의 정(情)과 색(色)이 크게 다르지 못하야 사람들은 몹시 순박하야 여름과 겨울을 가질 뿐에 그치는 것 같다.
이리하야 푸른 하늘과 바다가 깃들이고 있는 곳이면 꿈이 엉키리라 생각됨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현실이 있다.
가을이 되면 산업과 경제가 극히 건실한 나의 고향은 그 반면(反面)에 세계적 빈약과 불건실(不健實)을 차지하고 있어서 내가 여기서 나의 고향의 가을을 담당하야 쓰기에는 실상은 편집자의 상상이 너무 아름다웠던 듯하다. (끝)
(출처 《조광》 1938년 9월호)
| 김광섭(金珖燮·1904~1977년). 아호는 이산(怡山). 함북 경성 출생. 경성고등보통학교, 중동학교, 와세다대 영문과 졸업. 경희대 교수 역임. 《자유문학》을 발행했으며 시집으로 《성북동 비둘기》 《반응(反應)》 《김광섭시전집》과 번역시 《서정시집(抒情詩集)》(1958) 등이 있다. |
추석 로맨스 ‘한가위’란 어떤 명절인가
이병기
 명절 가운데 가장 좋은 명절이 추석이외다.
명절 가운데 가장 좋은 명절이 추석이외다.이때는 마침 곡식들이 풍성하게 익고, 과일들은 단맛이 들고 바람은 서늘하고 달은 밝습니다.
그리고 추석은 조선의 명절이외다. 조선에서는 이 명절을 다른 명절보다도 더 낫게 여기며 좋아하는 것이고, 이 명절에 대하여 재미스러운 이야기며 놀음, 놀이도 많이 있던 것이외다.
수수께끼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가위 하나를 사람마다 쓰는 것이 무엇이냐?
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8월 한가위’, 이것이 그 대답이외다.
음력 8월 15일을 ‘가위’ 또는 ‘가배’라고 말하는데, 가위라는 말은 마치 바느질에 쓰는 가위(가새)와도 같으므로 이렇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위라는 말은 어찌하여 생긴 것인가를 말하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900여 년 전 신라의 유리 임금 때입니다. 임금이 그때 여섯 부락을 정하고 부락의 여자들을 다시 두 편으로 나누어 임금의 따님 두 사람으로 하여 각각 그 한 편을 맡게 하여 편을 짜가지고 7월 16일부터 날마다 대궐 안에 모여 질쌈(길쌈의 경상도 방언. 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모든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편집자)을 하고 밤이 이윽하여(‘밤이 꽤 깊다’의 평안도 방언. 표준어는 이슥하다-편집자) 파하였습니다.
이러하여 8월 15일에 이르러서는 그 질쌈의 잘하고 못함을 상고하고, 진 편은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 사례하게 하며, 또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온갖 노래를 다 하게 하였는데, 이걸 곧 가위 또는 가배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마당에서 가난한 한 가난한 집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고 한탄하는 소리로 ‘회소, 회소’ 하였는데, 그 소리가 퍽이나 애처로워서 그 뒷사람이 그 소리로 하여 노래를 짓고 회소곡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음력 8월 15일을 ‘한가위’라고 함은 이러하거니와 이날을 또 추석이라 함은 그 뒤에 한문을 더 숭상하며 지어 부르던 것이외다. 추석은 물론 한문 그 뜻대로 ‘가을 저녁’이라는 것이지요만은, 가위라는 뜻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가위’의 ‘한’이라는 말은 ‘크다’는 말로써 지금도 ‘한글’ ‘한아버지’ 하야 쓰이는 말입니다.
회소곡이라는 노래도 지금은 전하지 않고 이조에 와서는 글 잘 쓰는 어른들이 한문으로 지은 회소곡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필재라는 이의 것을 대강 번역하여 드리면
회소 회소
바람 불고 달은 밝다.
공주와 6부 여자
함께 질쌈을 하네
네 광주리는 차고
내 광주리는 빈다
회소 회소
하는 이것이 얼만큼 그때 그 광경을 말하여주는 것이외다. 지금도 경상도 어느 지방에서는 추석과 같이 달이나 밝은 밤에 모여 유일을 하고 놀 때에는 서로들 “회소 회소” 하고 부르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의 유풍이나 아닌가 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이날 이러한 놀이가 있습니다.
달이 밝게 비치는 넓은 마당에 젊은 딸, 젊은 아들이 모여가지고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손목을 서로 잡고 삥 돌아 서서 여내 장단을 맞추어 발들을 움직이고 돌아다니며 또 노래도 부르는데 그 노래는,
대밭에는 대도 총총
강강수월래
하늘에는 별도 총총
강강수월래
꽃밭에는 꽃이 총총
강강수월래
하는 것이고 이러 하이 밤새는 줄도 모르고 신이 나서 논다 합니다.
한데 이 노래의 ‘강강술래’는 300여 년 전 임진란 때 처음 생긴 것이라고 하는 이가 있으나, 이 유희가 2000여 년 전 삼한 때부터 있었던 것인즉 그때부터 이 노래도 있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날 남자와 여자가 한데 모여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또 두 편을 갈라가지고 줄다리기를 하여 승부를 다투는데, 줄이 만일 중간에 끊어지든지 하면 두 편이 다 쓰러져 흩어지고 구경하는 이들은 손뼉을 치고 웃는다 하며 이걸 조리 놀이라고 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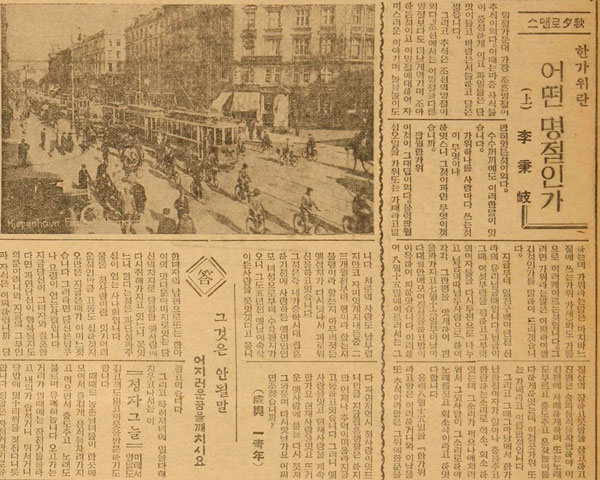 |
| 《조선중앙일보》 1934년 9월 22일과 23일에 걸쳐 연재된 이병기의 수필 〈추석 로맨스 ‘한가위’는 어떤 명절인가?〉이다. |
돈 많은 사람들이 미리 돈을 많이 주고 싸움 잘하는 찌락박이 황소를 사두고 부리지 않고 잘 먹이어 그 기운을 돋우고 임시해서는 더 잘 먹이고 혹은 인삼탕 같은 걸 먹이기도 하여 추석날을 당하면 남강 사장 같은 넓은 들판으로 끌고 나가 싸움을 시킵니다.
이날은 이곳에서 남녀노소 몇만 명이 모여 구경을 하는데, 소도 또한 승기가 나서 저의 재주를 다 부리어 혹은 나아가고 혹은 물러나오다 마침내 한 놈이 견디지 못하여 탈이 나면 한 놈은 그 기운이 나서 쫓아갑니다.
이때 이 이긴 편에서는 징, 꽹과리, 북 등을 둥둥 울리며 뛰고 춤추고 좋아들 합니다.
이런 놀이 외에도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북어쾌, 젓조기, 신도주, 오려송편, 박나물, 토란국 따위의 음식을 장만하여 놓고
즐거운 자 오늘이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항상 오늘 같이다
하는 노래를 부르며, 배들을 불릴 대로 불리고, 사당패도 불러 놀리기도 하며, 제물을 차려 선산에 가 제도 지내며, 며느리는 말미를 얻어 색동저고리며 술병을 가지고 본집으로 근친도 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즐거워하는 이는 즐거워하지만은 슬퍼하는 이는 여간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쁨도 장안에서 남모르게 눈물을 지우는 것도 있고, 북망산 같은 무덤에도 풀을 뜯으며 목을 놓고 우는 이도 있습니다. 과연 조득운이라는 이의 시에도
과부 추석을 당하여
청산에 저물도록 운다
산밑에 익어가는 조를
같이 갈고는 같이 못 먹네
하는 것이 이러한 정경을 그려낸 것이외다.
이와 같이 즐겁든 슬프든 추석은 좋은 명절이외다. 조선의 좋은 명절이외다.
(출처 《조선중앙일보》 1934년 9월 22, 23일 4면)
| 이병기(李秉岐·1891~1968년). 국문학자·시조시인. 본관은 연안(延安). 아호는 가람(嘉藍). 전라북도 익산 출생. 관립한성사범학교, 조선어강습원 졸업. 주요 저서로 《가람시조집》을 비롯하여 《국문학개론》 《국문학전사》 《가람문선》 등이 있다. |
곡(哭) 안익태(安益泰) 선생
박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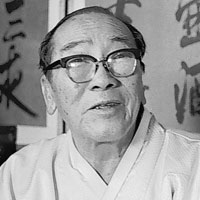 삼가
삼가안익태 선생 영전(靈前)에 조사(吊辭)를 드리나이다.
지난 9월 17일 선생이 서반아(西班牙) 바르셀로나에서 돌연(突然) 별세(別世)하셨다는 구슬픈 음(音)을 듣고 우리들 모두는 지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 비만, 바다를 한 만리(萬里) 밖에서 다만 창공(蒼空)을 바라보며 선생의 온지(溫和)하셨던 용모(容貌)를 아로새겨 모시었을 뿐입니다.
이제 선생이 세상을 떠나신 후 49일을 당하여, 당신의 모국인 한국에서는 각계각층(各界各層)의 많은 인사들이 선생의 평생의 업적을 추모(追慕)하여 오늘 벅찬 슬픔을 가슴에 가득히 껴안고 선생의 영(靈)을 불러 흐느껴 울면서 두 손 모아 선생의 명복(冥福)을 비옵니다. 선생은 약관(弱冠) 때 이미 일본국립음악학교를 졸업하고 미주로 건너가 필라델피아 음악학교를 다시 졸업한 후에, 웅지(雄志)를 더 한번 펴서 유럽에 유학, 헝가리 국립음악학교에서 수학(修學)하신 후, 이듬해 1945년에는 서반아 ‘마요르카’ 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가 되시어 오늘날까지 20년 동안 무수한 세계교향악단의 지휘자가 되셨습니다.
이리하여 선생은 한국 음악인의 포부(抱負)를 높이고, 한국의 작곡가가 얼마나 우수한 역량(力量)을 가졌는가를 국제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더욱 선생을 존경하고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의 애국가를 새로 작곡하셨고, 민족 얼의 상징인 ‘논개(論介)’의 작곡입니다. 선생! 홀연(忽然)히 가시니 나이 60은 아직 이르지 아니합니까. 웬일이오니까, 너무나 허전하고, 쓸쓸하고 애달픕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천재교육을 위한 음악원을 설립하시려던 큰 포부는 누구한테 맡기고 가셨습니까. 국립교향악단을 구성하여 한국의 서양음악을 세계 수준에 도달시키겠다던 그 희망(希望)은 누구에게 전(傳)하고 가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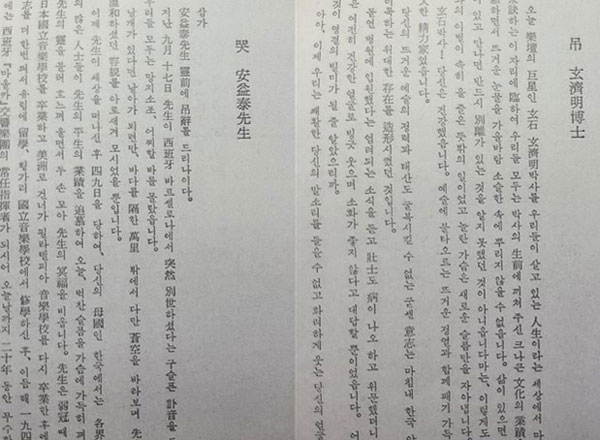 |
| 월탄 박종화 선생이 쓴 조사 〈곡(哭) 안익태 선생〉과 〈조(吊) 현제명 박사〉. |
삼가 선생의 명복을 비옵니다.
1965년 11월
예술원회장 박종화
조(吊) 현제명(玄濟明) 박사
박종화
오늘 악단의 거성(巨星)인 현석(玄石) 현제명 박사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세상에서 마지막 영결(永訣)하는 이 자리에 임(臨)하여 우리들 모두는 박사의 생전에 끼쳐주신 크나큰 문화의 업적을 추모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가을바람 소슬한 속에 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만나면 반드시 별리(別離)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옵니다마는, 이렇게도 당신과의 이별이 속히 올 줄은 뜻밖의 일이었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만을 자아냅니다. 현석 박사! 당신은 건강했습니다. 예술에 불타오르는 뜨거운 정열과 함께 패기 가득한 위대한 정력가(精力家)였습니다.
당신의 뜨거운 예술의 정력과 태산도 굴복시킬 수 없는 굳센 의지(意志)는 마침내 한국 악단의 이룩하는 위대한 존재를 조형(造形)시켰던 것입니다.
돌연 병원에 입원했다는 염려되는 소식을 듣고 ‘장사(壯士)도 병(病)이 나오’ 하고 위문했더니 당신 몸은 여전히 건강한 얼굴로 빙긋 웃으며 소화가 좋지 않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어찌 이것이 영결의 빌미가 될 줄 알았으리까.
아아, 이제 우리는 쾌활한 당신의 말소리를 들을 수 없고 화려하게 웃는 당신의 얼굴을 대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의지할 수 없는 가족들, 의지할 수 없는 수많은 제자들의 할 수 없는 수많은 벗들 어찌하오리까. 그러나 우리들 모두 다 슬퍼하는 속에 당신은 가신 것이 아니라 문화사(文化史)상에 영생(永生)하셨습니다. 무(無)에서 유(有)를 갖게 하신 당신의 불멸의 큰 업적은 예술도 빛나고 사업도 찬연하옵니다. 약관 때부터 근 60에 이르기까지 40년에 뻗친 음악 생활은 이 나라 초창기의 교향악을 완성시켰고 콜롬비아 음반에 남겨둔 당신의 성악 예술은 천의무봉(天衣無縫)의 경지를 개척하였습니다. 더구나 ‘고향 생각’ 외 무수한 작곡과 〈춘향전〉 〈왕자 호동〉 등의 오페라 창작은 한국적 오페라를 처음으로 수립해놓은 크나큰 창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해방 이후 1년 동안 고심참담(苦心慘擔) 용왕매진(勇往邁進)하면서 음악 대학교를 형극(荊棘)의 길에서 창설하여 후진을 양성시키는 이 대사업은 당신의 음악 예술과 함께 영원히 빛날 금자탑을 세워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육체를 보내는 우리는 슬프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영생하여 우리의 주위에 빛나고 있습니다. 박사여, 명목(瞑目)하소서. 우리는 당신을 보내지 아니합니다.
단기 4293년(서기 1960년-편집자) 10월 20일
| 박종화(朴鍾和·1901~1981년). 아호는 월탄(月灘). 휘문고보 졸업. 시집으로 《흑방비곡》 《청자부》, 역사소설로 《금삼의 피》 《대춘부》 《자고 가는 저 구름아》 등이 있다. 대한민국예술원장을 역임했다. 1969년부터 1977년까지 장장 8년에 걸쳐 《조선일보》에 연재한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신문소설 사상 2456회라는 최장기록을 남겼다. |
전시(戰時) 추석절 유감(有感)
신익희
 오늘은 음력으로 팔월이라 중추석 가배(嘉俳)의 명절이다. 2000년 전, 신라 시대의 이날은 길쌈을 장려하고 품평하는 날이었으나 그 후 세월이 흐르고 기대(幾代)의 왕조가 바뀌는 동안에 이날은 중추의 명절로서 즐기게 되어 산 사람은 새 옷을 입고 새 음식을 먹으며 죽은 이들을 생각하여서는 제사를 지낸다.
오늘은 음력으로 팔월이라 중추석 가배(嘉俳)의 명절이다. 2000년 전, 신라 시대의 이날은 길쌈을 장려하고 품평하는 날이었으나 그 후 세월이 흐르고 기대(幾代)의 왕조가 바뀌는 동안에 이날은 중추의 명절로서 즐기게 되어 산 사람은 새 옷을 입고 새 음식을 먹으며 죽은 이들을 생각하여서는 제사를 지낸다.전란 중에 지내는 이 나라의 이날은 그 어떠할 것이냐? 그 본래의 뜻으로 보아서는 당연히 즐거움이 많고 슬픔이 적을 이날이언만은 실상으로는 얼마나 많은 슬픔이 이 나라 국민의 모든 가정에 차게 되었느냐,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이날의 송편 그릇을 앞에 놓고 그 떡이 목에 넘어가지 아니하여 눈물로써 그 송편을 적시리라. 남편을 잃은 청상(靑孀)들은 흰 옷에 흰 댕기를 들이고 산소에 가서 통곡하리라.
어떠한 예를 들어가면 집집마다 소장(素帳)을 늘인 상청(喪廳)이 놓였다 하니, 이것은 공비의 대량 학살로 생긴 비참한 자취이다. 얼마나 많은 상에서 통곡소리가 들리느냐? 6·25까지 평화스럽고 행복스럽던 가정이 공비에게 그 주인이 납치되어 고단(孤單)한 어머니의 연약한 팔로 수다한 자녀들을 벌어 먹이느라고 낮이나 밤이나 고생을 하면서 얼마나 북천(北天)을 바라보고 한숨지으랴.
다시 머리를 병원으로 돌릴 때에는 싸움에 부상한 후 고통에 못 이기어 창백하게 된 상이군인들의 얼굴이 나타난다. 그들의 장래를 어떻게 위안하고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 것이냐!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할 뿐이다.
전선에서는 추석날, 이 아침에도 여전히 쉬지 않고 전투가 벌어졌으리라. 중추의 밝은 달은 그들이 살던 고향의 초가집을 비추듯이 그들이 입고 있는 융의(戎衣)도 비추고 철투구도 비추리라. 구름도 쉬어 넘는 산악지대에서 싸움의 피곤으로 돌을 베고 풀을 깔고 누운 그들의 머리맡에도 가을의 귀뚜라미는 시름없이 울고 있으리라.
나의 머리에는 눈을 감고 있으면 이 나라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장면이 거대한 ‘파노라마’와도 같이 핑핑 돌고 있다
전선의 소식을 듣건대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해발 수천 척의 산악지대에서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싸우고 있다 한다.
철투구에 총검을 들고 험준한 산악을 비호같이 달리는 우리 애국 청년들의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 듯하다.
역사를 쓰는 거인(巨人)들아! 누가 그대들의 키가 작다 하여 왜소(矮小)하다고 하랴! 70개국의 젊은 영웅들은 저마다 그릇된 길로 가려는 인류사(人類史)의 길을 바로잡으려고 정의의 칼을 들고 전열(戰列)에 나선 것이다. 전 인류의 자유를 위하여 일찍이 한국을 지도로밖에 보지 않았던 세계 각국의 용사들은 한 전장에 모여 같은 목적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니, 이것은 바로 인류사가 있은 이래 최초의 시험이요, 또한 전사상(戰史上) 미증유(未曾有)의 일이다.
우리 병사들은 사라지려는 조국을 구하고 또는 무고(無辜)히 죽는 동포들을 구하는 동시에 이 위대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들의 눈은 거광(炬光)과 같이 번쩍인다. 그 번쩍이는 눈에서는 쉴 새 없이 정의의 광명이 흐르고 있다. 이 광명은 전 세계에 방사(放射)하여 모든 불의와 죄악을 불사르고 말리라.
인류가 있은 지 기만년(幾萬年)! 역사가 있은 지도 수천 년! 인류는 끊임없이 해방과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여 왔다. 그런데 현하의 공산전체주의는 경제적 평등이라는 허울 좋은 구실하에 전 세계의 자유를 또 한번 무서운 폭군의 쇠사슬로 옭아매려고 외람하게도 발악하면서 전 인류가 몇 세기 동안 피로 싸워 얻은 인간의 기본적 존엄에까지 도전하여 온 것이다.
생각건대 20세기 후반의 역사는 모든 사회상 평등과 함께 이 자유의 찬탈자(簒奪者)와 싸우는 것으로 차게 되리라. 그리하여 마침내는 정경대도(正逕大道)인 길로 바로잡으리라.
하늘은 어찌하여 한민족을 골랐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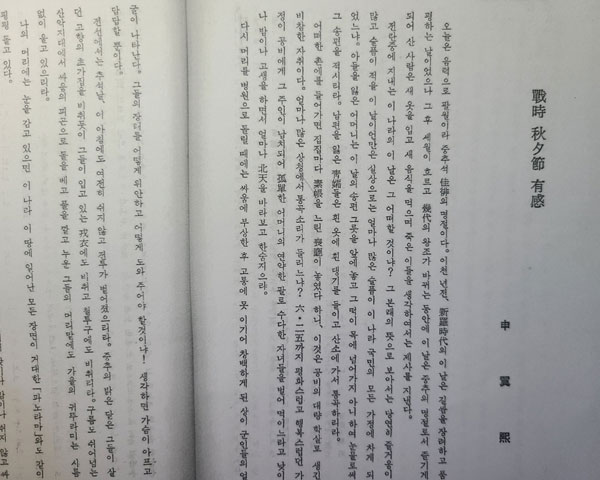 |
| 신익희 선생이 쓴 에세이 〈전시 추석절 유감〉. 6·25전쟁 중인 1952년 9월 15일에 썼다. |
우리 조국으로서나 전 세계의 정세로서나 완전한 승리까지는 아직도 기다(幾多)의 형극(荊棘)의 길이 앞에 놓였다. 그러나 ‘리프맨’의 지적과 같이 세계사의 앞에는 확실히 장미꽃 빛의 여명이 저 지평선상에 온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도 그 빛을 맞기 위하여 이 거대한 진통을 하는 것이다. 다만 그 대표적 희생을 하늘은 어찌하여 한민족을 골랐는가? 이론적이 아니라 감상적으로 슬퍼하고 또한 울게 됨은 우리 동포의 비참이 너무도 큰 데에 기막힌 때문이다. (1952년 9월 15일)
| 신익희(申翼熙·1893~1956년). 호는 해공(海公). 경기도 광주 출생. 임정 각 부 총장 역임. 1945년 귀국 후 입법의원의장(立法議院議長), 국민대 학장, 국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195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거 유세 중 급서(急逝)했다.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중장(重章)이 추서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