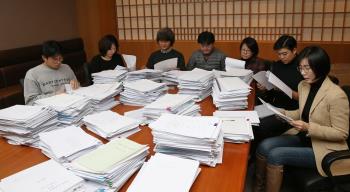일본의 진정한 주체성은 자위대를 나라의 적자(嫡子)로 하는 데서만 얻어질 것이라고 주노(主奴) 변증법은 일러주고 있다. 냉전이 끝나고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가 노적(奴的) 국가를 끝내는 타이밍이었을 것이다. 전전(戰前)의 만세일계(萬世一系) 같은 허구가 전후(戰後)의 평화헌법 아닐 것인가.

- 1951년 7월 미·일 안보조약에 서명하는 요시다 시게루 일본 수상(가운데). 이후 일본은 미국의 노적(奴的)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일본의 패색이 굳어졌던 1944년, 마리아나 해전(海戰)에서 침몰했던 전함 무사시(武藏)에서 기적적으로 생환한 한 병사가, 검열이 다 지나간 훗날(1977년) 천황을 통렬히 비판하는 책을 냈다(《깨 부서진 神》, 渡邊淸). 병사가 1945년 10월 하순 마을에 돌아와서 보니, 일본에 온 지 두 달 남짓한 맥아더를 이미 사람들은 ‘새 천황’ 혹은 천황 위에 있는 ‘새 국왕’이라 부르고 있더라는 것이다.
원폭(原爆)의 위력을 전쟁 심판의 결정력으로 보는 한 평자(評者)는, 그것은 천황의 위광(威光)을 능가하는 것으로서, 원자폭탄이 천황을 신(神)에서 인간으로 바꿔 놓았다고 했다. 그러고는 ‘점령기의 천황의 공위(空位·빈자리)’에 미국의 힘을 체현(體現)하고 있는 맥아더를 앉히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加藤典洋, <アメリカの影>)
미국의 조야(朝野)를 향해서도 맥아더의 권위는 높았다. 맥아더는 미국의 일개 군인이었으나 그 격(格)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상위에 위치하는, 미국을 포함하는 연합국의 일본주둔군 총사령관이기도 했다. 그는 1945년 8월, 연합국이 승리하여 전쟁이 끝나고서도 개선 귀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6·25 전쟁의 전략문제로 트루먼 대통령과 회합할 때에도 도쿄(東京)와 워싱턴의 중간 지점인 태평양상의 웨이크도(島)까지만 갔다.
맥아더가 6·25 전쟁의 전략문제로 1951년 4월 해임되었을 때는 일본에 온 지 5년8개월이 지나 있었다. 포츠담 선언의 요청대로 일본의 비(非)군사화와 민주주의화 작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일본독립을 위한 강화조약을 내다보는 포석도 끝나 있었다.
미국은 그를 영웅으로 맞이했다. 그는 “노병(老兵)은 죽지 않고 사라져 갈 뿐이다”라는 명구로 1951년 4월 19일 상하 양원합동의회에서의 연설을 끝맺었다. 그가 미국 육사(陸士) 창립 이래의 역사에서 최고기록인 98.14의 평균점으로 졸업했던 시절, 막사에 유행했던 노래 속에 이 구절이 있었다 한다.
맥아더, “일본인의 정신연령은 12살”
이 맥아더가 미국에 돌아가 일본인의 정신연령이 12살이라 했던 것이다. 이는 5월 5일 미국 상원 외교·군사 합동위원회에서의 증언에 들어 있다. 맥아더는 일본인의 자질을 높이 칭찬하고 있었는데, 독일인과 비교하고 있었다. 연이은 질문과 답은 다음과 같다.
문(問): “일본인은 점령군 밑에서 얻은 자유를 금후에도 옹호해 갈 것인가. 일본인은 이 점에서 신용할 수 있는가.”
답(答): “그렇습니다. 독일의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일본의 문제와 다릅니다. 독일인은 성숙한 인종(a mature race)이었습니다.
만일 앵글로 색슨이 인간으로서의 발달이란 점에서 과학이라든지, 예술·종교·문화 등에서 대강 45세라 한다면, 독일인도 완전히 같은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인은, 시간적으로는 옛적부터 있어 온 사람들입니다만 지도를 받아야 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대문명의 척도로 잰다면, 우리들은 45세로 성숙한 연령인 것에 비한다면 12살의 소년정도라고나 할까요(like a boy of twelve).
지도를 받을 시기에는 어디에서도 그렇지만, 일본인은 새 모범이나 새 사고방식을 쉬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서는 기본이 되는 생각을 심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인은 이제 갓 태어난, 유연하고 새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독일인은 우리들처럼 성숙해 있었습니다. 독일인들이 근대적인 도덕을 포기한다든지 국제 간의 규범을 깨었을 때는, 그건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독일인은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일본인은 어느 정도 그랬습니다. 이와 달리 독일인들은 비틀비틀하다가 어쩌다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은 없습니다. 독일인은 스스로의 군사력을 고려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권력과 경제제패에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숙고한 정책으로서 그걸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인은 전연 달랐습니다. 닮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敗北を抱きしめて》)
동맹 노릇을 할 수 없는 武力, 자위대
이 ‘12살’ 발언이 있고 나서, 일본에서의 맥아더 숭배열은 급속히 식어 버렸다. 동상을 세운다, 도쿄의 명예시민으로 한다, 기념관을 짓는다 등의 얘기가 어느새 흐지부지되어 버렸다.
맥아더의 ‘일본인 12살론(論)’을 평화헌법과 연관하여 음미하고자 한다. 평화헌법안(案)은 맥아더가 지휘, 제작하여 일본측에 안긴 것이었다. 전쟁포기, 비무장, 교전권 부인의 제9조는 특히 맥아더의 구상으로 보인다. 지난 호에서 당시 수상 시데하라(幣原喜重郞)와의 담판에서 천황의 도쿄전범재판 면소(免訴)와 전쟁포기 조항이 바터된 것을 보았다.
맥아더 구상은 물론 미국 본부가 추인한 것이었겠지만, 냉전(冷戰)이 격화되고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측에는 벌써 비무장 조항 설정에 대한 후회가 있었던 것 같다. 일본 독립으로 가는 평화조약 체결을 담당했던 덜레스 특사(特使)는 당시의 수상 요시다(吉田茂)에게 일본 재군비를 수차에 걸쳐 강력히 요구했으나, 평화헌법을 들어 저항했다.
점령군사령관 맥아더는 미군이 6·25에 참전하면서, 일본에 경찰예비대라는 이름의 실질적 무력(武力)의 창설을 명령하고 보안대·자위대로 이름을 바꿔 가지만, 그것이 평화헌법이 있는 한 ‘국가의 본질’이 군사력인 한에서의 적자(嫡子)일 수는 없었다.
미·일(美日) 동맹에서 자위대는 동맹노릇을 수행할 수 없는 무력이었다. 1991년 이라크 전쟁 때, 유엔결의를 배경으로 한 다국적군(軍) 편성에 일본은 한 명의 자위대도 보내지 못했다. 미·일 동맹 관계도 있는지라 일본은 전비(戰費) 150억 달러의 거금으로 기여했다.
전쟁이 끝난 후 쿠웨이트 정부는 《뉴욕타임스》지에 광고를 내어 다국적군에 참가한 각 나라에 감사했다. 그러나 그 속에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은 없었다. 일본헌법 전문에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명예 있는 지위’를 얻는 데 150억 달러의 거금은 무력(無力)했다.
이때 일본사람들은 평화헌법과 자위대의 이율배반적 관계에 얽힌 비애를 곱씹었을 것이다.
‘일본 12살론’의 배경
포츠담 선언에 의해, 상당한 군사적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일본을 비군사화하는 것이 점령군 사령관 맥아더의 2대 임무 중 하나였다. 맥아더가 비군사화를 위해 일본의 ‘비무장’을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비무장’을 한시적일 수 있는 정책 선언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일본은 점령이 끝난 독립 후에도 정상적인 군사력을 가질 수 없었고,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여, 지난호에서 보았듯이 미국과의 사이에 헤겔적 주인-노예 관계를 영속시키게 되었다.
맥아더는 일본의 비군사화 임무를 과잉 수행한 것인가. 냉전이 격화되면서 일본의 평화헌법을 미국측도 불편해했으니까. 돌아온 맥아더를 붙들고 미국의 조야는, 남의 나라 헌법이니까 드러내 놓고 ‘비무장’ 규정 경위를 따질 수는 없다 해도, 일본 ‘비무장’의 발상배경을 궁금해하는 분위기는 만들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맥아더의 해명이 ‘일본 12살론’이 아니었나 한다. 앞에서 인용해 놓은 미 의회 증언에서 맥아더는 앵글로 색슨이나 독일인이 45살이라면 일본인(의 정신연령)은 틴에이저(13~19살) 직전인 12살이라 했다. 일본인은 ‘지도를 받아야 할 상태’였음을 지적했는데, 맥아더는 이를 통해 일본인의 사고의 미숙성과 새 모델과 새 사고방식에의 감수성을 강조해 보였다. 맥아더는 언외(言外)에 일본인들이 집착해야 할 아이덴티티가 부실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행동규범으로 작용할 “기본이 되는 생각을 심어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 대목이 일본 헌법에 ‘비무장’을 규정할 수 있었던 사정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부끄럼 문화’와 脫군사화
점령 당국이 일본헌법에 ‘전쟁포기, 비무장’을 규정하게 된 또 하나의 사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 속에 있는 일본인론이다. 베네딕트 여사는 미국 군사 당국의 용역으로 일본인 연구를 하였고, 그 결론은 일본 점령통치에 전폭적으로 활용되었음은 알려져 있다.
《국화와 칼》 속에 있는 유명한 ‘죄의 문화’, ‘부끄럼 문화’론을 간략히 하면, 일본사람들은 ‘부끄럼 문화’에 속하는데, ‘죄의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윤리규범을 내면화하여 윤리적 행동은 하려 드는데 반해, 일본 같은 ‘부끄럼 문화’에서는 외면적 강제가 없을 경우에는 윤리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점령당국은 ‘비무장’의 헌법 규정만이 일본의 탈(脫)군사화를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맥아더의 12살론과 베네딕트의 ‘죄의 문화’, ‘부끄럼 문화’론이 합력하여 ‘전쟁포기 비무장’ 헌법을 있게 했다 하겠다.
맥아더와 점령 당국이 독립 후 일본의 노적(奴的) 국가화를 노렸거나 예상한 것 같지는 않다. 맥아더는 평화헌법을 제정, 시행한 첫해인 1947년 단계에서 점령 종결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다.
패전(敗戰)한 나라가 영구적으로 무장해제하고 그로 인한 결과로 안보를 승자(勝者)에 의존하면, 의존하는 패자(敗者)의 자기의식은 노예의식이 되고 만다는 주-노(主-奴) 변증법의 귀결을 점령 당국이 계산했을 것 같지는 않다.
독일과 일본의 과거청산
독일과 일본은 모두 제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抽軸國)으로 패전했으나, 보수(保守)체제로 경제를 부흥시켜 국제사회에 복귀한 유사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전쟁의 과거를 반성, 청산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고, 곧잘 대비되고 있다.
전후(戰後) 서독(西獨) 보수의 원점(原點) 아데나워 수상은 과거청산에 적극적이었다. 아데나워는 과거청산에 시간과 정력과 국력(國力)을 쏟아 서구 국제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신뢰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는 과거청산을 거부하고 침략의 행적을 변명·합리화하여 이웃 한국 대통령 이승만(李承晩)과의 화해에 실패한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수상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아데나워에게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도의(道義)와 윤리의 잣대가 있었다. 그의 회고록 속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보인다.
“어찌하여 나치스 제국이 독일 국민 속에 생겨나게 되었는가, 나는 자문(自問)했다. 처음에는 무해(無害)한 사람들에 의해 환호 속에 맞이되었으나, 종내는 그 바닥 모를 속악함과 비열함 때문에 많은 독일인들이 두려워하고 경멸하고 저주한 그 나치스 제국.”
“나는 전쟁 동안에 스위스 총영사 폰 바이스 씨로부터, 독일인들이 독일인에 가한 부끄러워해야 할 행위와 그리고 인류에 대해 계획된 범죄행위를 들어서 알게 됐다.”
“나는 나치스 시대에 독일인인 것을 몇 번이나 부끄러워했다. 마음속 깊이 부끄러워했다.”
요시다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쇼와(昭和) 군국주의(軍國主義)나 파시즘의 죄악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를 사과하라’ 했을 때 ‘군국주의자들이 한 짓’이라고 도망했지만, 정작 군국주의자들의 범죄성에 대한 인식은 전혀 갖지 못했다.
군국주의나 전쟁을 어쩌다가 비판할 경우에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쟁수행자들의 서툴고 비합리적인 운영방식, 잘못된 전략선택, 그래서 패전을 초래한 책임을 따질 뿐이었다. 군국주의나 전쟁의 윤리성에 대한 인식은 아예 있지 않았다. 이런 요시다에게 한국을, 아시아 여러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배한 일본 제국주의의 죄악에 대한 비판이나 반성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네 권으로 된 요시다의 회상록 《회상십년(回想十年)》을 다 훑어도 이와 같은 비판과 반성은 안 보인다.
“조선에 은혜 입혔다”
과거의 반성 위에 서는 아데나워는 청산, 속죄행에 과감하고 열심이었다. 아데나워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배상문제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연립정권의 파트너나 재정 당국의 난색을 물리치고 직접 차고 앉아 문제를 풀어 갔는데, 그의 정적(政敵)들까지도 그의 ‘도의적 책임감’을 높이 평가했다.(大嶽秀夫, 《아데나워와 吉田茂》)
아데나워의 정치경륜 자체가 과거 반성을 딛고 펼쳐지는 것이었다. 그는 히틀러가 침략하여 점령했던 프랑스와의 화해를 외교상의 최중요 과제로 하였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여기에 집중했다. 독일은 루르 탄전(炭田)지대를 내놓고 프랑스 및 베네룩스 3국의 중공업 통합을 선도하여, 경제적 이유만으로도 두 번 다시 이웃을 침략할 수 없는 구조를 목표로 했다. 그 결과로 아데나워는 유럽 석탄철강공동체를 실현해 냈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경제공동체 구상에 전력을 기울여 오늘날 유럽연합(EU)의 길을 닦은 것은 다 알고 있는 일이다.
같이 패전한 나라 일본의 수상 요시다의 이웃과 사는 방식은 사뭇 달랐다. 6·25 전쟁이 터지자 요시다의 제일성이 “천우신조(天佑神助)”였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얘기다. 요시다의 인격을 잘 드러내는 얘기라 할 것이다.
요시다의 감은 적중했다. 미국의 발주를 받아 일본은 군수(軍需)공장이 되었고, 경기는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한국전 5년 만인 1955년에 잿더미 속에 있던 일본경제는 이미 2차대전 전 수준을 회복했던 것이다.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이 6·25 전쟁 중에 시작되었다. 두 나라 모두 미국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요시다가 수상인 동안 회담은 과거문제에 대한 일본측 자세로 암초에 얹혀져 버렸다.
일본측 발언의 핵심요지는 일본의 조선망국과 지배통치는 조선을 근대화시키고 경제를 발전시켜 조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혔다는 것이었다.
1952년, 53년 이때가, 일본은 강화독립을 하고 한국특수로 경제는 일어나, 요시다 정치는 정점에 있었고 한국은 가혹한 전화로 바닥을 헤맬 때였다. 나라를 뺏고 단물은 다 빨고서 은혜를 입혔다니, 누군들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는가. 이때에 수상 요시다는 외상을 겸하고 있었다. 회담대표는 이구치(井口) 차관 등 요시다의 심복들이었다. “(나라 뺏긴)조선에 은혜를 입혔다”는 것은 요시다 자신의 역사인식이었던 것이다.
요시다의 제국의식-광복 후 韓日관계 원점에 요시다 시게루가
일본점령사 연구의 권위인 MIT 교수 존 다우어의 학자로서의 입신작은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연구였다. 다우어가 《요시다 시게루와 그 시대》에서 강조해 보인 것은 요시다의 제국의식이었다. 그는 1930년대 말에 주영(駐英)대사까지 역임했으나 엘리트 외교관은 아니었고, 국내외의 큰 정치사안에 크게 관여된 적도 없었다.
유신(維新)의 원훈이자 근대 일본 관료의 원조인 독재자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의 둘째 아들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顯)는 궁내(宮內)대신, 내대신(內大臣) 등으로 천황 측근 궁정정치의 실권자였다. 요시다는 특출할 것 없었지만 양자로 가서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배경 때문인지, 이 마키노의 사위가 됨으로써 군벌(軍閥)이 득세했을 때는 군벌 눈에 거슬리는 황실주변 인물로 취급되었다. 성공치 못한 종전(終戰) 상소에 일부 간여했다고 헌병대에 40일간 구류되는 일도 있었다. 이 일이 요시다를 패전일본의 점령통치에 승선할 수 있는 티켓을 마련해 주었다 할 수 있다.
전범(戰犯)재판을 앞두고 자살하기 전, 일본의 앞날을 걱정하던 귀족 수상 고노에(近衛文麿)는 점령하 두 번째의 시데하라(幣原) 내각이 외무대신으로 요시다를 거론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인물평을 한마디했다. “요시다 군에 대해 나도 누구보다 그를 좋아하지만, 요시다 군의 의식은 ‘대일본제국’ 시대의 의식이다. 이것이 패전한 일본의 지금부터에 잘 맞을 수 있을까”였다.
다우어는 요시다의 제국의식을 가시화하느라고 세계 규모로 예를 들어 보인다.
“예를 들면 인도제국이라면 짤막한 승마용 채찍을 흔들어대며 뽐내면서 걷고 있는 영주, 필리핀이라면 아메리카의 행정관으로 갈색의 난쟁이 형제들 앞에 설교를 늘어놓으며 군림하는 모습, 알제리라면 런던이나 워싱턴의 고관들 앞에서는 만세를 외치면서, 서구형 반체제 분자를 보면 마상에서 사냥개를 풀어 몰아붙이는 모습 등이다.”
다우어는 식민지에 군림하는 오만한 상전형 인간형을 요시다가 신출내기 외교관으로 압록강변의 안동(安東) 영사로 근무하던 시절에서 연상해 내고 있다.
요시다, 安東영사 시절 조선인觀 형성
요시다는 특별한 재주는 없어도, 고위급의 사이가 뜬 권력자나 권위자로부터 드물게 응석을 받아 낼 줄 아는 재주를 지녔던 것 같다. 그리고 주눅들 줄 몰랐다.
요시다가 중국 안동(安東)영사로 오기 2년 전 봉천(奉天)에 있을 땐데, 총영사가 본국으로 간 부재 중에 위세등등하던 군벌 총수 데라우치(寺內正穀) 대장이 일·러 전쟁 뒤처리의 일로 만주에 왔다. 젊은 요시다가 접대역을 맡았는데, 전혀 주눅들지 않는 것이 데라우치 인상에 남았던 모양이다.
요시다는 안동영사로 오게 되자 서울의 조선총독 데라우치의 비서를 겸하게 되었다. 천황의 명으로 조선의 나라를 빼앗고, 반항자를 모두 도륙하여 야만적 식민지배 체제를 깐 자가 데라우치 아니던가.
요시다의 외교관 임지는 안동이 제일 길었다. 데라우치가 총리대신이 되어 서울을 떠날 때까지의 4년간이었다. 경의선 철도로 서울을 드나들면서, 안동서는 주로 조선인들끼리의 송사(訟事)를 재정(裁定)하는 일이었다. 이때 갖게 된 조선인관(觀)을 그는 평생 붙들고 있은 것 같다. 분쟁 속에 있는 사람들 보고 조선사람 이미지를 만든 것이다. ‘조선인은 말다툼을 좋아한다’ ‘투쟁심이 왕성하다’ ‘화해할 줄 모른다’ 등으로.
요시다는 총리도 다 끝낸 만년(晩年), 한일(韓日)회담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쓴 회상풍의 글에서도, 조선침탈에서 시작된 아시아 침략에는 한마디 반성도 없이, 회담부진의 이유로 이승만의 ‘반일(反日)정책’을 들면서 ‘이승만 정부 시대가 말하는 것 같이, 일본의 한국통치가 고통만 준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다.(吉田茂, <世界と日本>, 番町書房, 1963)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나라를 뺏어 지배한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인식을 끝내 갖지 못하고 있다.
죄의 근원에 눈 감고, 표피적 이해타산으로 일상을 꾸리러 드는 것은 노예의식이다. 일본이 어떻게 노적(奴的) 국가가 되었는가는 앞에서 본 바 있다.
한국은 이승만이 역사의 매듭을 풀어 한일 양(兩) 민족의 영원한 화해와 우호를 위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으나 일본은 받지 않았다. 일본과는 평화헌법과 안보조약으로 헤겔적 주-노(主-奴) 관계가 된 미국은 일본 편을 들었다.
일본인의 어리광
과거청산 없는 일본을 싸안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이승만은 저항했다. 이 한미(韓美) 긴장을, 요시다의 외교감각이 한일회담에서 과거 청산을 버티는 데 활용하고 나왔던 것이다. 전쟁 속에 있는 신생국을 건져 최소한도의 나라 모양을 갖추려 들었던 이승만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몰(沒)도의적 일본외교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은 잘 모르는, 이승만 위에 몰아닥친 정치 풍상의 진원이었던 것이다.
강화조약으로 일본은 독립했지만, 일본 땅에 군대라곤 미국 군대만 있었다. 헌법이 자위대를 ‘거세’된 ‘장물’일 수밖에 없게 했다. 환관의 대처(帶妻) 같은 존재였다. 1991년의 이라크 전쟁 때 군대 한 명 보내지 못하고 그 본질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아이젠하워·덜레스의 세계전략이 일본 경제를 중시하여 군수 기능 위주의 아시아 반공(反共)센터로 하였고, 한국과 타이완(臺灣)에는 국력에 어울리지 않게 미군의 연장선상의 지상군을 두는 것이었다. 원조를 하면서 돈은 일본서 쓰라는 것이 미국의 주문이었다. 한국경제가 일어날 여지는 없었다.
미·일 주-노 관계를, 미국은 일본에 아시아 냉전의 베이스캠프를 둠으로써 활용하고, 일본은 투쟁성(무력)이 지양된 노(奴)에 허락된 노동(경제)에 전념함으로써 부국(富國)노선으로 활용했다. 좌파와 다수 국민이 미·일 안보조약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일어섰던 1960년 안보투쟁이라는 것은 주-노(主-奴) 변증법의 시각으로 보면 노적(奴的) 국가 국민들의 어리광(甘え)이다.
안보조약을 불가피하게 한 것은 평화헌법인데 헌법은 손도 안 대고 반미(反美)만 한다고 터부가 되어 입에 올리지 못하는 주-노(主-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어리광이란 오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안보조약 유지가 국회에서 확정되자, 노적 국가화 작업을 지휘했던 요시다의 수제자인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수상이 나섰다. 이케다의 소득배증 노선에 따라 일본국민들은 언제 그랬더냐는 듯이 고도성장으로 질주하여 거대한 성취를 이룩했다. 동시에 주-노(主-奴) 관계도 의식 밖으로, 무의식으로 밀어넣어 버린 것 같다.
요시다의 養子性
요시다가 노적(奴的) 국가화 작업을 지휘했다 했는데 설명을 보태야 할 것이다.
요시다가 한 일은 크게 두 가지다. 맥아더가 준 평화헌법안을 일본정부안으로 하여 국회심의 등 제정과정을 총괄한 것과, 독립 전후에 미국의 재군비 요구를 억제하고, 안보조약으로 미군의 계속 주류(駐留)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주-노(主-奴) 변증법으로 보면, 노적(奴的) 입장이 된 일본의 적대성 지양의 자세를 명확히 한 것이고, 주-노(主-奴) 관계에서 필수적인 주(主)의 공포를 노(奴) 곁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심정적이고 국위발양주의적 ‘제국의식’이 강한 요시다가 어떻게 맥아더의 뜻을 받아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의 답이 있다.
보수 우파의 논객이면서 전후 일본의 제일급 문학평론가인 에토 준(江戶淳)은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에 있어서의 양자성(養子性)을 요시다 정치를 설명하는 하나의 키로 사용하고 있다.(加藤典洋, <アメリカの影>)
들어본다.
<요시다 시게루는 그 출신부터, 먼저 요시다가(家)의 양자로서 자라고, 다음에는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顯·앞에서 보았음)의 양자적 존재(사위)로 되었는데, 전후에는 일본자유당의 ‘양자’적 정치가로서 대성하게 되었다.
여기서 일관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강운성(强運性)이라 하겠다. 그는 요시다가(家)에서는 ‘양자’라고는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상속자로서 요시다가를 올라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재산을 다 써 버렸다.
또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의 정치적 양자로서 출발한 요시다 시게루는 문칸방을 빌리는가 했더니 안방까지 완전히 장중(掌中)에 넣어버린 것이다. 요시다는 실은 이 같은 정치입장으로 맥아더 점령군의 ‘양자’로도 된 것이다.>
그러나 에토(江藤)는 점령군하고의 관련에서, 요시다가 어쩔 수 없이 ‘양자’는 되었지만, 맥아더를 ‘부친’이 아니라 교섭상대로 인식했다면서, 요시다의 ‘양자성’을 통해 전체적으로는 운명을 도전적으로 열어 가는 강운성을 지적하려 하고 있다.
실제는 좀 달랐던 게 아닐까. 자유당의 경우, 하토야마는 처음부터 공직 추방되어 부친 노릇을 할 수 없었고, 당(黨)의 양자라 해도 그 의사는 요시다가 누구 눈치 관계없이 결정하는 입장이었다. 이 경우 요시다의 ‘양자성’보다는 ‘강운(强運)’을 지적하는 게 맞을 것이다.
요시다의 ‘양자성’이 제일 한껏 발휘된 것은 맥아더와의 사이가 아니었나 한다.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가토(加藤典洋)는, 원폭(原爆)과 2차대전과 천황에 대해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준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 전날에 미국의 원폭개발 착수 결정이 있었고, 포츠담회담의 전날 로스앨러모스에서 원폭실험이 성공하였으며, 이를 딛고 포츠담선언이 나왔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자 일본 천황은 바로 이 포츠담선언 수락을 결정하여 항복했던 것이다.
이 타이밍은 모두가 극비의 것이었다. 이를 두고 원폭과 2차대전과 천황의 존재 사이에 작동하는 어떤 초월적 의지의 암합에 가토는 특별한 주목을 보내고 있다.
인간의 불이 아닌 원폭의 마력(魔力)을 미국의 힘으로 일본에서 상징하는 자는 맥아더였고, 전쟁 전 천황의 위광(威光)을 점령 일본에서 체현하고 숭앙받은 것은 맥아더였으며, 그에게는 신의 대리인 매무새가 있었다는 것이다.(‘戰後再見 天皇, 原爆, 無條件降伏’,《アメリカの影》)
웬일인지 필자는 가토의 지적에 공감이 간다. ‘양자’의 성공조건을 따져 본다면, 핏줄의 과거가 아니라 현전하는 부적(父的) 권위에 순응·추종하여 그동안의 아이덴티티와 무관한 현실에 민첩하게 적응하는 것일 것이다. 요시다가 맥아더 앞에 이 같은 ‘양자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지 않았나 한다. 요시다의 정치적 업적으로 거론되는 ‘재(再)군비 거부’가 기실은 맥아더의 의향과 노선을 그대로 답습한 것임을 외교사가 오카자키(岡崎久彦)는 논증해 보이고 있다.(《吉田 茂とその時代》)
主-奴 변증법과 경제대국
헤겔의 주·노 변증법으로 미·일 관계를 설명한 예가 하나 있었다. 미국의 일본점령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 일본경제가 질적(質的)으로 미국을 능가하여, 미·일 간에 격렬한 무역마찰이 일어나고, 미국경제의 세계공장으로서의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게 될 때까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일본점령 정책 연구의 전문가인 이오키베 마코토(五百旗頭眞) 교수의 《일미전쟁(日米戰爭)과 전후 일본(戰後 日本)》(講談社 學術文庫) 속에 있다.
천문학적인 대일(對日) 무역적자로 미국 경제사회의 고통은 심각했다. 이를 배경으로 재팬 배싱(일본 때리기) 여론이 비등하면서 《뉴욕타임스 매거진》(1985년 여름)에 실린 한 저널리스트 칼럼을 이오키베는 소개한다.
<일본으로부터의 위험>이라는 제목이다. “나는 미조리 함상에서 무릎을 꿇은 일본을 목격했다. 아메리카의 점령정책과 원조에 의해 일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듯이, 일본은 거리낌도 없이 미국시장을 석권하고는 경쟁에 질 만한 분야는 국내를 개방도 안 한다. 약아빠진 데다 ‘페어’하지 못한 일본이여, 이것으로 다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줄거리다.
일본측의 행태를 점령정치 시절까지 소급하여 거론하는 분위기가 미국에 있었다. 이를 두고, 이오키베는 “거기에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가 스러져 가는 것에의 안타까움과 함께 미·일의 경제관계의 역전(逆轉)이 지나치게 관대했던 점령정책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은, ‘배반당한 파트론’의 심리가 나타나 있는 것이다”고 했다.
이오키베가 원용하고 있는 주-노(主-奴) 변증법의 논리를 따르면 미국은 일본의 ‘파트론’이 아니고 주-노 관계의 ‘주인’이라 해야 할 것이다. 비록 경제분야일지라도 1980년대 들어 미·일 관계의 역전현상을 설명하는 데 주-노 변증법이 유효하다고 본 것 같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오키베가 주-노 변증법을 부연한 부분을 그대로 옮겨 보겠다.
이오키베의 主-奴 변증법
<주인이 노예에게 항아리를 만들라고 명령한다. 항아리 만들기에 흥미를 갖지 않는 노예는 불만이지만, 주인의 명령인 것이다. 할 수 없다면서 노예는 강제되어 항아리 만들기를 시작한다. 주인은 노예에게 연일연야 반복해서 엄하게 항아리 만들기를 강제한다. 그 반복 속에서,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역전이 일어난다. 주인은 자기자신과 명령의 노예로 되고 인간성을 상실한다. 관리한다는 것의 노예로 된다.
한편 노예는 당초는 왜 항아리 만들기 따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고 불만이었지만, 점차 흥미를 갖기 시작한다. 항아리 만들기 그 자체가 스스로의 기쁨으로 되고, 자기실현을 얻게 된다. 이리하여 주체성을 빼앗겼던 노예 쪽이 주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역전이 일어난다.
점령하의 일본측의 대응은 그것에 닮아 있다. 승자가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강제했던바, 그것을 굴욕으로 느끼는 일본인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면서 그 일에 착수한다. 종내는 일본인은 그 일에 몰두하여 열심히 학습하고, 그걸 받침대로 눈부신 자기혁신을 수행하여 성장하게 된다. 비군사적인 경제중심의 생활방식은 강제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드디어 그것은 일본 자신의 바라는 바가 되고, 무기를 들라고 ‘주인’이 요구해도 항아리 만들기에서 떠날 수 없게 된다.>
이오키베는 난해한 주-노 변증법을 알아볼 수 있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주인과 노예로 출발하였다가, 주인이 투쟁에만 집착해 있는 사이에 노예는 자기 노동으로 스스로와 세계를 변모시키며 생명유지를 위해 포기했던 주체성을 회복케 된다고 원래 ‘변증법’은 말하고 있었다. 나아가서 자유를 실현케 된 노예는 그 자유를 주인이 인정케 하여 주-노 간에 상호 승인되었을 때, 노(奴)는 진정한 충족이 되고 역사는 완결된다 하고 있다.
상호승인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유에 눈뜬 노(奴)가 주(主)가 갖는 외포(畏怖)를 이겨내야 하고, 죽음의 불안을 넘어서야 하고, 자유를 위한 주(主)와의 투쟁에서 위험 앞에 생명을 던지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노(主-奴) 변증법에서 힌트를 얻는다면 노(奴)는 성장한 자기를 주(主) 앞에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헌법이라는 허구
미·일 관계에 적용해 본다면, 일본경제가 미국에 육박하여, 무역마찰이 심했을 때 노적(奴的) 신분성을 극복하자 했다면, 그 같은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그때에 시장을 완전공개하고 자기를 ‘주(主)와의 투쟁 앞에 던졌다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었을 것이다.
원래 주-노 변증법은 전쟁이나 안보문제로 발단하고 있다. 일본의 진정한 주체성은 자위대를 나라의 적자로 하는 데서만 얻어질 것이라고 주-노 변증법은 일러주고 있다. 냉전이 끝나고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가 노적(奴的) 국가를 끝내는 타이밍이었을 것이다.
전전(戰前)의 만세일계(萬世一系) 같은 허구가 전후(戰後)의 평화헌법 아닐 것인가. 이웃과 평화를 말하자면 우선 기본적인 전제는 같아야 할 것이다.⊙
원폭(原爆)의 위력을 전쟁 심판의 결정력으로 보는 한 평자(評者)는, 그것은 천황의 위광(威光)을 능가하는 것으로서, 원자폭탄이 천황을 신(神)에서 인간으로 바꿔 놓았다고 했다. 그러고는 ‘점령기의 천황의 공위(空位·빈자리)’에 미국의 힘을 체현(體現)하고 있는 맥아더를 앉히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加藤典洋, <アメリカの影>)
미국의 조야(朝野)를 향해서도 맥아더의 권위는 높았다. 맥아더는 미국의 일개 군인이었으나 그 격(格)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상위에 위치하는, 미국을 포함하는 연합국의 일본주둔군 총사령관이기도 했다. 그는 1945년 8월, 연합국이 승리하여 전쟁이 끝나고서도 개선 귀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6·25 전쟁의 전략문제로 트루먼 대통령과 회합할 때에도 도쿄(東京)와 워싱턴의 중간 지점인 태평양상의 웨이크도(島)까지만 갔다.
맥아더가 6·25 전쟁의 전략문제로 1951년 4월 해임되었을 때는 일본에 온 지 5년8개월이 지나 있었다. 포츠담 선언의 요청대로 일본의 비(非)군사화와 민주주의화 작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일본독립을 위한 강화조약을 내다보는 포석도 끝나 있었다.
미국은 그를 영웅으로 맞이했다. 그는 “노병(老兵)은 죽지 않고 사라져 갈 뿐이다”라는 명구로 1951년 4월 19일 상하 양원합동의회에서의 연설을 끝맺었다. 그가 미국 육사(陸士) 창립 이래의 역사에서 최고기록인 98.14의 평균점으로 졸업했던 시절, 막사에 유행했던 노래 속에 이 구절이 있었다 한다.
맥아더, “일본인의 정신연령은 12살”
이 맥아더가 미국에 돌아가 일본인의 정신연령이 12살이라 했던 것이다. 이는 5월 5일 미국 상원 외교·군사 합동위원회에서의 증언에 들어 있다. 맥아더는 일본인의 자질을 높이 칭찬하고 있었는데, 독일인과 비교하고 있었다. 연이은 질문과 답은 다음과 같다.
문(問): “일본인은 점령군 밑에서 얻은 자유를 금후에도 옹호해 갈 것인가. 일본인은 이 점에서 신용할 수 있는가.”
답(答): “그렇습니다. 독일의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일본의 문제와 다릅니다. 독일인은 성숙한 인종(a mature race)이었습니다.
만일 앵글로 색슨이 인간으로서의 발달이란 점에서 과학이라든지, 예술·종교·문화 등에서 대강 45세라 한다면, 독일인도 완전히 같은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인은, 시간적으로는 옛적부터 있어 온 사람들입니다만 지도를 받아야 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대문명의 척도로 잰다면, 우리들은 45세로 성숙한 연령인 것에 비한다면 12살의 소년정도라고나 할까요(like a boy of twelve).
지도를 받을 시기에는 어디에서도 그렇지만, 일본인은 새 모범이나 새 사고방식을 쉬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서는 기본이 되는 생각을 심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인은 이제 갓 태어난, 유연하고 새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독일인은 우리들처럼 성숙해 있었습니다. 독일인들이 근대적인 도덕을 포기한다든지 국제 간의 규범을 깨었을 때는, 그건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독일인은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일본인은 어느 정도 그랬습니다. 이와 달리 독일인들은 비틀비틀하다가 어쩌다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은 없습니다. 독일인은 스스로의 군사력을 고려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권력과 경제제패에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숙고한 정책으로서 그걸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인은 전연 달랐습니다. 닮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敗北を抱きしめて》)
동맹 노릇을 할 수 없는 武力, 자위대
 |
| 요시다 수상에게 일본의 재무장을 강권했던 덜레스 특사. |
맥아더의 ‘일본인 12살론(論)’을 평화헌법과 연관하여 음미하고자 한다. 평화헌법안(案)은 맥아더가 지휘, 제작하여 일본측에 안긴 것이었다. 전쟁포기, 비무장, 교전권 부인의 제9조는 특히 맥아더의 구상으로 보인다. 지난 호에서 당시 수상 시데하라(幣原喜重郞)와의 담판에서 천황의 도쿄전범재판 면소(免訴)와 전쟁포기 조항이 바터된 것을 보았다.
맥아더 구상은 물론 미국 본부가 추인한 것이었겠지만, 냉전(冷戰)이 격화되고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측에는 벌써 비무장 조항 설정에 대한 후회가 있었던 것 같다. 일본 독립으로 가는 평화조약 체결을 담당했던 덜레스 특사(特使)는 당시의 수상 요시다(吉田茂)에게 일본 재군비를 수차에 걸쳐 강력히 요구했으나, 평화헌법을 들어 저항했다.
점령군사령관 맥아더는 미군이 6·25에 참전하면서, 일본에 경찰예비대라는 이름의 실질적 무력(武力)의 창설을 명령하고 보안대·자위대로 이름을 바꿔 가지만, 그것이 평화헌법이 있는 한 ‘국가의 본질’이 군사력인 한에서의 적자(嫡子)일 수는 없었다.
미·일(美日) 동맹에서 자위대는 동맹노릇을 수행할 수 없는 무력이었다. 1991년 이라크 전쟁 때, 유엔결의를 배경으로 한 다국적군(軍) 편성에 일본은 한 명의 자위대도 보내지 못했다. 미·일 동맹 관계도 있는지라 일본은 전비(戰費) 150억 달러의 거금으로 기여했다.
전쟁이 끝난 후 쿠웨이트 정부는 《뉴욕타임스》지에 광고를 내어 다국적군에 참가한 각 나라에 감사했다. 그러나 그 속에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은 없었다. 일본헌법 전문에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명예 있는 지위’를 얻는 데 150억 달러의 거금은 무력(無力)했다.
이때 일본사람들은 평화헌법과 자위대의 이율배반적 관계에 얽힌 비애를 곱씹었을 것이다.
‘일본 12살론’의 배경
포츠담 선언에 의해, 상당한 군사적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일본을 비군사화하는 것이 점령군 사령관 맥아더의 2대 임무 중 하나였다. 맥아더가 비군사화를 위해 일본의 ‘비무장’을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비무장’을 한시적일 수 있는 정책 선언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일본은 점령이 끝난 독립 후에도 정상적인 군사력을 가질 수 없었고,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여, 지난호에서 보았듯이 미국과의 사이에 헤겔적 주인-노예 관계를 영속시키게 되었다.
맥아더는 일본의 비군사화 임무를 과잉 수행한 것인가. 냉전이 격화되면서 일본의 평화헌법을 미국측도 불편해했으니까. 돌아온 맥아더를 붙들고 미국의 조야는, 남의 나라 헌법이니까 드러내 놓고 ‘비무장’ 규정 경위를 따질 수는 없다 해도, 일본 ‘비무장’의 발상배경을 궁금해하는 분위기는 만들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맥아더의 해명이 ‘일본 12살론’이 아니었나 한다. 앞에서 인용해 놓은 미 의회 증언에서 맥아더는 앵글로 색슨이나 독일인이 45살이라면 일본인(의 정신연령)은 틴에이저(13~19살) 직전인 12살이라 했다. 일본인은 ‘지도를 받아야 할 상태’였음을 지적했는데, 맥아더는 이를 통해 일본인의 사고의 미숙성과 새 모델과 새 사고방식에의 감수성을 강조해 보였다. 맥아더는 언외(言外)에 일본인들이 집착해야 할 아이덴티티가 부실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행동규범으로 작용할 “기본이 되는 생각을 심어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 대목이 일본 헌법에 ‘비무장’을 규정할 수 있었던 사정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부끄럼 문화’와 脫군사화
점령 당국이 일본헌법에 ‘전쟁포기, 비무장’을 규정하게 된 또 하나의 사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 속에 있는 일본인론이다. 베네딕트 여사는 미국 군사 당국의 용역으로 일본인 연구를 하였고, 그 결론은 일본 점령통치에 전폭적으로 활용되었음은 알려져 있다.
《국화와 칼》 속에 있는 유명한 ‘죄의 문화’, ‘부끄럼 문화’론을 간략히 하면, 일본사람들은 ‘부끄럼 문화’에 속하는데, ‘죄의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윤리규범을 내면화하여 윤리적 행동은 하려 드는데 반해, 일본 같은 ‘부끄럼 문화’에서는 외면적 강제가 없을 경우에는 윤리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점령당국은 ‘비무장’의 헌법 규정만이 일본의 탈(脫)군사화를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맥아더의 12살론과 베네딕트의 ‘죄의 문화’, ‘부끄럼 문화’론이 합력하여 ‘전쟁포기 비무장’ 헌법을 있게 했다 하겠다.
맥아더와 점령 당국이 독립 후 일본의 노적(奴的) 국가화를 노렸거나 예상한 것 같지는 않다. 맥아더는 평화헌법을 제정, 시행한 첫해인 1947년 단계에서 점령 종결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다.
패전(敗戰)한 나라가 영구적으로 무장해제하고 그로 인한 결과로 안보를 승자(勝者)에 의존하면, 의존하는 패자(敗者)의 자기의식은 노예의식이 되고 만다는 주-노(主-奴) 변증법의 귀결을 점령 당국이 계산했을 것 같지는 않다.
독일과 일본의 과거청산
 |
| 아데나워(오른쪽) 독일 수상은 과거사 청산과 프랑스와의 화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왼쪽은 드골 프랑스 대통령. |
전후(戰後) 서독(西獨) 보수의 원점(原點) 아데나워 수상은 과거청산에 적극적이었다. 아데나워는 과거청산에 시간과 정력과 국력(國力)을 쏟아 서구 국제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신뢰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는 과거청산을 거부하고 침략의 행적을 변명·합리화하여 이웃 한국 대통령 이승만(李承晩)과의 화해에 실패한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수상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아데나워에게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도의(道義)와 윤리의 잣대가 있었다. 그의 회고록 속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보인다.
“어찌하여 나치스 제국이 독일 국민 속에 생겨나게 되었는가, 나는 자문(自問)했다. 처음에는 무해(無害)한 사람들에 의해 환호 속에 맞이되었으나, 종내는 그 바닥 모를 속악함과 비열함 때문에 많은 독일인들이 두려워하고 경멸하고 저주한 그 나치스 제국.”
“나는 전쟁 동안에 스위스 총영사 폰 바이스 씨로부터, 독일인들이 독일인에 가한 부끄러워해야 할 행위와 그리고 인류에 대해 계획된 범죄행위를 들어서 알게 됐다.”
“나는 나치스 시대에 독일인인 것을 몇 번이나 부끄러워했다. 마음속 깊이 부끄러워했다.”
요시다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쇼와(昭和) 군국주의(軍國主義)나 파시즘의 죄악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과거를 사과하라’ 했을 때 ‘군국주의자들이 한 짓’이라고 도망했지만, 정작 군국주의자들의 범죄성에 대한 인식은 전혀 갖지 못했다.
군국주의나 전쟁을 어쩌다가 비판할 경우에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쟁수행자들의 서툴고 비합리적인 운영방식, 잘못된 전략선택, 그래서 패전을 초래한 책임을 따질 뿐이었다. 군국주의나 전쟁의 윤리성에 대한 인식은 아예 있지 않았다. 이런 요시다에게 한국을, 아시아 여러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배한 일본 제국주의의 죄악에 대한 비판이나 반성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네 권으로 된 요시다의 회상록 《회상십년(回想十年)》을 다 훑어도 이와 같은 비판과 반성은 안 보인다.
“조선에 은혜 입혔다”
과거의 반성 위에 서는 아데나워는 청산, 속죄행에 과감하고 열심이었다. 아데나워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배상문제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연립정권의 파트너나 재정 당국의 난색을 물리치고 직접 차고 앉아 문제를 풀어 갔는데, 그의 정적(政敵)들까지도 그의 ‘도의적 책임감’을 높이 평가했다.(大嶽秀夫, 《아데나워와 吉田茂》)
아데나워의 정치경륜 자체가 과거 반성을 딛고 펼쳐지는 것이었다. 그는 히틀러가 침략하여 점령했던 프랑스와의 화해를 외교상의 최중요 과제로 하였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여기에 집중했다. 독일은 루르 탄전(炭田)지대를 내놓고 프랑스 및 베네룩스 3국의 중공업 통합을 선도하여, 경제적 이유만으로도 두 번 다시 이웃을 침략할 수 없는 구조를 목표로 했다. 그 결과로 아데나워는 유럽 석탄철강공동체를 실현해 냈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경제공동체 구상에 전력을 기울여 오늘날 유럽연합(EU)의 길을 닦은 것은 다 알고 있는 일이다.
같이 패전한 나라 일본의 수상 요시다의 이웃과 사는 방식은 사뭇 달랐다. 6·25 전쟁이 터지자 요시다의 제일성이 “천우신조(天佑神助)”였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얘기다. 요시다의 인격을 잘 드러내는 얘기라 할 것이다.
요시다의 감은 적중했다. 미국의 발주를 받아 일본은 군수(軍需)공장이 되었고, 경기는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한국전 5년 만인 1955년에 잿더미 속에 있던 일본경제는 이미 2차대전 전 수준을 회복했던 것이다.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이 6·25 전쟁 중에 시작되었다. 두 나라 모두 미국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요시다가 수상인 동안 회담은 과거문제에 대한 일본측 자세로 암초에 얹혀져 버렸다.
일본측 발언의 핵심요지는 일본의 조선망국과 지배통치는 조선을 근대화시키고 경제를 발전시켜 조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혔다는 것이었다.
1952년, 53년 이때가, 일본은 강화독립을 하고 한국특수로 경제는 일어나, 요시다 정치는 정점에 있었고 한국은 가혹한 전화로 바닥을 헤맬 때였다. 나라를 뺏고 단물은 다 빨고서 은혜를 입혔다니, 누군들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는가. 이때에 수상 요시다는 외상을 겸하고 있었다. 회담대표는 이구치(井口) 차관 등 요시다의 심복들이었다. “(나라 뺏긴)조선에 은혜를 입혔다”는 것은 요시다 자신의 역사인식이었던 것이다.
요시다의 제국의식-광복 후 韓日관계 원점에 요시다 시게루가
 |
| 요시다 수상의 장인 마키노 노부아키. |
유신(維新)의 원훈이자 근대 일본 관료의 원조인 독재자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의 둘째 아들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顯)는 궁내(宮內)대신, 내대신(內大臣) 등으로 천황 측근 궁정정치의 실권자였다. 요시다는 특출할 것 없었지만 양자로 가서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배경 때문인지, 이 마키노의 사위가 됨으로써 군벌(軍閥)이 득세했을 때는 군벌 눈에 거슬리는 황실주변 인물로 취급되었다. 성공치 못한 종전(終戰) 상소에 일부 간여했다고 헌병대에 40일간 구류되는 일도 있었다. 이 일이 요시다를 패전일본의 점령통치에 승선할 수 있는 티켓을 마련해 주었다 할 수 있다.
전범(戰犯)재판을 앞두고 자살하기 전, 일본의 앞날을 걱정하던 귀족 수상 고노에(近衛文麿)는 점령하 두 번째의 시데하라(幣原) 내각이 외무대신으로 요시다를 거론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인물평을 한마디했다. “요시다 군에 대해 나도 누구보다 그를 좋아하지만, 요시다 군의 의식은 ‘대일본제국’ 시대의 의식이다. 이것이 패전한 일본의 지금부터에 잘 맞을 수 있을까”였다.
다우어는 요시다의 제국의식을 가시화하느라고 세계 규모로 예를 들어 보인다.
“예를 들면 인도제국이라면 짤막한 승마용 채찍을 흔들어대며 뽐내면서 걷고 있는 영주, 필리핀이라면 아메리카의 행정관으로 갈색의 난쟁이 형제들 앞에 설교를 늘어놓으며 군림하는 모습, 알제리라면 런던이나 워싱턴의 고관들 앞에서는 만세를 외치면서, 서구형 반체제 분자를 보면 마상에서 사냥개를 풀어 몰아붙이는 모습 등이다.”
다우어는 식민지에 군림하는 오만한 상전형 인간형을 요시다가 신출내기 외교관으로 압록강변의 안동(安東) 영사로 근무하던 시절에서 연상해 내고 있다.
요시다, 安東영사 시절 조선인觀 형성
 |
| 1943년 1월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오른쪽)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가운데)이 요시다 시게루 일본 수상(왼쪽)을 만났다. |
요시다가 중국 안동(安東)영사로 오기 2년 전 봉천(奉天)에 있을 땐데, 총영사가 본국으로 간 부재 중에 위세등등하던 군벌 총수 데라우치(寺內正穀) 대장이 일·러 전쟁 뒤처리의 일로 만주에 왔다. 젊은 요시다가 접대역을 맡았는데, 전혀 주눅들지 않는 것이 데라우치 인상에 남았던 모양이다.
요시다는 안동영사로 오게 되자 서울의 조선총독 데라우치의 비서를 겸하게 되었다. 천황의 명으로 조선의 나라를 빼앗고, 반항자를 모두 도륙하여 야만적 식민지배 체제를 깐 자가 데라우치 아니던가.
요시다의 외교관 임지는 안동이 제일 길었다. 데라우치가 총리대신이 되어 서울을 떠날 때까지의 4년간이었다. 경의선 철도로 서울을 드나들면서, 안동서는 주로 조선인들끼리의 송사(訟事)를 재정(裁定)하는 일이었다. 이때 갖게 된 조선인관(觀)을 그는 평생 붙들고 있은 것 같다. 분쟁 속에 있는 사람들 보고 조선사람 이미지를 만든 것이다. ‘조선인은 말다툼을 좋아한다’ ‘투쟁심이 왕성하다’ ‘화해할 줄 모른다’ 등으로.
요시다는 총리도 다 끝낸 만년(晩年), 한일(韓日)회담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쓴 회상풍의 글에서도, 조선침탈에서 시작된 아시아 침략에는 한마디 반성도 없이, 회담부진의 이유로 이승만의 ‘반일(反日)정책’을 들면서 ‘이승만 정부 시대가 말하는 것 같이, 일본의 한국통치가 고통만 준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다.(吉田茂, <世界と日本>, 番町書房, 1963)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나라를 뺏어 지배한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인식을 끝내 갖지 못하고 있다.
죄의 근원에 눈 감고, 표피적 이해타산으로 일상을 꾸리러 드는 것은 노예의식이다. 일본이 어떻게 노적(奴的) 국가가 되었는가는 앞에서 본 바 있다.
한국은 이승만이 역사의 매듭을 풀어 한일 양(兩) 민족의 영원한 화해와 우호를 위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으나 일본은 받지 않았다. 일본과는 평화헌법과 안보조약으로 헤겔적 주-노(主-奴) 관계가 된 미국은 일본 편을 들었다.
일본인의 어리광
과거청산 없는 일본을 싸안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이승만은 저항했다. 이 한미(韓美) 긴장을, 요시다의 외교감각이 한일회담에서 과거 청산을 버티는 데 활용하고 나왔던 것이다. 전쟁 속에 있는 신생국을 건져 최소한도의 나라 모양을 갖추려 들었던 이승만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몰(沒)도의적 일본외교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국민들은 잘 모르는, 이승만 위에 몰아닥친 정치 풍상의 진원이었던 것이다.
강화조약으로 일본은 독립했지만, 일본 땅에 군대라곤 미국 군대만 있었다. 헌법이 자위대를 ‘거세’된 ‘장물’일 수밖에 없게 했다. 환관의 대처(帶妻) 같은 존재였다. 1991년의 이라크 전쟁 때 군대 한 명 보내지 못하고 그 본질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아이젠하워·덜레스의 세계전략이 일본 경제를 중시하여 군수 기능 위주의 아시아 반공(反共)센터로 하였고, 한국과 타이완(臺灣)에는 국력에 어울리지 않게 미군의 연장선상의 지상군을 두는 것이었다. 원조를 하면서 돈은 일본서 쓰라는 것이 미국의 주문이었다. 한국경제가 일어날 여지는 없었다.
미·일 주-노 관계를, 미국은 일본에 아시아 냉전의 베이스캠프를 둠으로써 활용하고, 일본은 투쟁성(무력)이 지양된 노(奴)에 허락된 노동(경제)에 전념함으로써 부국(富國)노선으로 활용했다. 좌파와 다수 국민이 미·일 안보조약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일어섰던 1960년 안보투쟁이라는 것은 주-노(主-奴) 변증법의 시각으로 보면 노적(奴的) 국가 국민들의 어리광(甘え)이다.
안보조약을 불가피하게 한 것은 평화헌법인데 헌법은 손도 안 대고 반미(反美)만 한다고 터부가 되어 입에 올리지 못하는 주-노(主-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어리광이란 오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안보조약 유지가 국회에서 확정되자, 노적 국가화 작업을 지휘했던 요시다의 수제자인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수상이 나섰다. 이케다의 소득배증 노선에 따라 일본국민들은 언제 그랬더냐는 듯이 고도성장으로 질주하여 거대한 성취를 이룩했다. 동시에 주-노(主-奴) 관계도 의식 밖으로, 무의식으로 밀어넣어 버린 것 같다.
요시다의 養子性
 |
| 요시다 수상은 맥아더(왼쪽)와도 일종의 양자적(養子的) 관계를 유지했다. |
요시다가 한 일은 크게 두 가지다. 맥아더가 준 평화헌법안을 일본정부안으로 하여 국회심의 등 제정과정을 총괄한 것과, 독립 전후에 미국의 재군비 요구를 억제하고, 안보조약으로 미군의 계속 주류(駐留)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주-노(主-奴) 변증법으로 보면, 노적(奴的) 입장이 된 일본의 적대성 지양의 자세를 명확히 한 것이고, 주-노(主-奴) 관계에서 필수적인 주(主)의 공포를 노(奴) 곁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심정적이고 국위발양주의적 ‘제국의식’이 강한 요시다가 어떻게 맥아더의 뜻을 받아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의 답이 있다.
보수 우파의 논객이면서 전후 일본의 제일급 문학평론가인 에토 준(江戶淳)은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에 있어서의 양자성(養子性)을 요시다 정치를 설명하는 하나의 키로 사용하고 있다.(加藤典洋, <アメリカの影>)
들어본다.
<요시다 시게루는 그 출신부터, 먼저 요시다가(家)의 양자로서 자라고, 다음에는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顯·앞에서 보았음)의 양자적 존재(사위)로 되었는데, 전후에는 일본자유당의 ‘양자’적 정치가로서 대성하게 되었다.
여기서 일관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강운성(强運性)이라 하겠다. 그는 요시다가(家)에서는 ‘양자’라고는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상속자로서 요시다가를 올라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재산을 다 써 버렸다.
또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의 정치적 양자로서 출발한 요시다 시게루는 문칸방을 빌리는가 했더니 안방까지 완전히 장중(掌中)에 넣어버린 것이다. 요시다는 실은 이 같은 정치입장으로 맥아더 점령군의 ‘양자’로도 된 것이다.>
그러나 에토(江藤)는 점령군하고의 관련에서, 요시다가 어쩔 수 없이 ‘양자’는 되었지만, 맥아더를 ‘부친’이 아니라 교섭상대로 인식했다면서, 요시다의 ‘양자성’을 통해 전체적으로는 운명을 도전적으로 열어 가는 강운성을 지적하려 하고 있다.
실제는 좀 달랐던 게 아닐까. 자유당의 경우, 하토야마는 처음부터 공직 추방되어 부친 노릇을 할 수 없었고, 당(黨)의 양자라 해도 그 의사는 요시다가 누구 눈치 관계없이 결정하는 입장이었다. 이 경우 요시다의 ‘양자성’보다는 ‘강운(强運)’을 지적하는 게 맞을 것이다.
요시다의 ‘양자성’이 제일 한껏 발휘된 것은 맥아더와의 사이가 아니었나 한다.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가토(加藤典洋)는, 원폭(原爆)과 2차대전과 천황에 대해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준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 전날에 미국의 원폭개발 착수 결정이 있었고, 포츠담회담의 전날 로스앨러모스에서 원폭실험이 성공하였으며, 이를 딛고 포츠담선언이 나왔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자 일본 천황은 바로 이 포츠담선언 수락을 결정하여 항복했던 것이다.
이 타이밍은 모두가 극비의 것이었다. 이를 두고 원폭과 2차대전과 천황의 존재 사이에 작동하는 어떤 초월적 의지의 암합에 가토는 특별한 주목을 보내고 있다.
인간의 불이 아닌 원폭의 마력(魔力)을 미국의 힘으로 일본에서 상징하는 자는 맥아더였고, 전쟁 전 천황의 위광(威光)을 점령 일본에서 체현하고 숭앙받은 것은 맥아더였으며, 그에게는 신의 대리인 매무새가 있었다는 것이다.(‘戰後再見 天皇, 原爆, 無條件降伏’,《アメリカの影》)
웬일인지 필자는 가토의 지적에 공감이 간다. ‘양자’의 성공조건을 따져 본다면, 핏줄의 과거가 아니라 현전하는 부적(父的) 권위에 순응·추종하여 그동안의 아이덴티티와 무관한 현실에 민첩하게 적응하는 것일 것이다. 요시다가 맥아더 앞에 이 같은 ‘양자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지 않았나 한다. 요시다의 정치적 업적으로 거론되는 ‘재(再)군비 거부’가 기실은 맥아더의 의향과 노선을 그대로 답습한 것임을 외교사가 오카자키(岡崎久彦)는 논증해 보이고 있다.(《吉田 茂とその時代》)
主-奴 변증법과 경제대국
헤겔의 주·노 변증법으로 미·일 관계를 설명한 예가 하나 있었다. 미국의 일본점령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 일본경제가 질적(質的)으로 미국을 능가하여, 미·일 간에 격렬한 무역마찰이 일어나고, 미국경제의 세계공장으로서의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게 될 때까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일본점령 정책 연구의 전문가인 이오키베 마코토(五百旗頭眞) 교수의 《일미전쟁(日米戰爭)과 전후 일본(戰後 日本)》(講談社 學術文庫) 속에 있다.
천문학적인 대일(對日) 무역적자로 미국 경제사회의 고통은 심각했다. 이를 배경으로 재팬 배싱(일본 때리기) 여론이 비등하면서 《뉴욕타임스 매거진》(1985년 여름)에 실린 한 저널리스트 칼럼을 이오키베는 소개한다.
<일본으로부터의 위험>이라는 제목이다. “나는 미조리 함상에서 무릎을 꿇은 일본을 목격했다. 아메리카의 점령정책과 원조에 의해 일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듯이, 일본은 거리낌도 없이 미국시장을 석권하고는 경쟁에 질 만한 분야는 국내를 개방도 안 한다. 약아빠진 데다 ‘페어’하지 못한 일본이여, 이것으로 다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줄거리다.
일본측의 행태를 점령정치 시절까지 소급하여 거론하는 분위기가 미국에 있었다. 이를 두고, 이오키베는 “거기에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가 스러져 가는 것에의 안타까움과 함께 미·일의 경제관계의 역전(逆轉)이 지나치게 관대했던 점령정책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은, ‘배반당한 파트론’의 심리가 나타나 있는 것이다”고 했다.
이오키베가 원용하고 있는 주-노(主-奴) 변증법의 논리를 따르면 미국은 일본의 ‘파트론’이 아니고 주-노 관계의 ‘주인’이라 해야 할 것이다. 비록 경제분야일지라도 1980년대 들어 미·일 관계의 역전현상을 설명하는 데 주-노 변증법이 유효하다고 본 것 같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오키베가 주-노 변증법을 부연한 부분을 그대로 옮겨 보겠다.
이오키베의 主-奴 변증법
<주인이 노예에게 항아리를 만들라고 명령한다. 항아리 만들기에 흥미를 갖지 않는 노예는 불만이지만, 주인의 명령인 것이다. 할 수 없다면서 노예는 강제되어 항아리 만들기를 시작한다. 주인은 노예에게 연일연야 반복해서 엄하게 항아리 만들기를 강제한다. 그 반복 속에서, 주인과 노예 사이에는 역전이 일어난다. 주인은 자기자신과 명령의 노예로 되고 인간성을 상실한다. 관리한다는 것의 노예로 된다.
한편 노예는 당초는 왜 항아리 만들기 따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고 불만이었지만, 점차 흥미를 갖기 시작한다. 항아리 만들기 그 자체가 스스로의 기쁨으로 되고, 자기실현을 얻게 된다. 이리하여 주체성을 빼앗겼던 노예 쪽이 주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역전이 일어난다.
점령하의 일본측의 대응은 그것에 닮아 있다. 승자가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강제했던바, 그것을 굴욕으로 느끼는 일본인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면서 그 일에 착수한다. 종내는 일본인은 그 일에 몰두하여 열심히 학습하고, 그걸 받침대로 눈부신 자기혁신을 수행하여 성장하게 된다. 비군사적인 경제중심의 생활방식은 강제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드디어 그것은 일본 자신의 바라는 바가 되고, 무기를 들라고 ‘주인’이 요구해도 항아리 만들기에서 떠날 수 없게 된다.>
이오키베는 난해한 주-노 변증법을 알아볼 수 있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주인과 노예로 출발하였다가, 주인이 투쟁에만 집착해 있는 사이에 노예는 자기 노동으로 스스로와 세계를 변모시키며 생명유지를 위해 포기했던 주체성을 회복케 된다고 원래 ‘변증법’은 말하고 있었다. 나아가서 자유를 실현케 된 노예는 그 자유를 주인이 인정케 하여 주-노 간에 상호 승인되었을 때, 노(奴)는 진정한 충족이 되고 역사는 완결된다 하고 있다.
상호승인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유에 눈뜬 노(奴)가 주(主)가 갖는 외포(畏怖)를 이겨내야 하고, 죽음의 불안을 넘어서야 하고, 자유를 위한 주(主)와의 투쟁에서 위험 앞에 생명을 던지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노(主-奴) 변증법에서 힌트를 얻는다면 노(奴)는 성장한 자기를 주(主) 앞에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헌법이라는 허구
미·일 관계에 적용해 본다면, 일본경제가 미국에 육박하여, 무역마찰이 심했을 때 노적(奴的) 신분성을 극복하자 했다면, 그 같은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그때에 시장을 완전공개하고 자기를 ‘주(主)와의 투쟁 앞에 던졌다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었을 것이다.
원래 주-노 변증법은 전쟁이나 안보문제로 발단하고 있다. 일본의 진정한 주체성은 자위대를 나라의 적자로 하는 데서만 얻어질 것이라고 주-노 변증법은 일러주고 있다. 냉전이 끝나고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가 노적(奴的) 국가를 끝내는 타이밍이었을 것이다.
전전(戰前)의 만세일계(萬世一系) 같은 허구가 전후(戰後)의 평화헌법 아닐 것인가. 이웃과 평화를 말하자면 우선 기본적인 전제는 같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