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全國紙 중 만년 5위, 연간 판매부수 180만 부, 오사카 등 긴키지역에서 주로 팔리는 사실상 지방지
⊙ 한국에서 《산케이신문》 구글링하면 《아사히신문》보다 3배, 일본에서는 《산케이신문》이
《아사히신문》의 1/10 수준
⊙ 박근혜와 명성황후 비교 칼럼 쓴 노구치 히로유키 기자는 ‘별종’ 소리 듣는 《산케이》 내 强性
안보전문 기자
⊙ “낙서를 읽고 응답하는 한국 언론과 정부가 이상할 뿐”(한 일본 기자)
劉敏鎬
⊙ 54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일본 마쓰시타 정경숙 15기.
⊙ SBS 보도국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 연구소(RIETI) 연구원.
⊙ 現 워싱턴 ‘Pacific, Inc’ 프로그램 디렉터, 딕 모리스 선거컨설턴트 아시아 담당 소장.
⊙ 한국에서 《산케이신문》 구글링하면 《아사히신문》보다 3배, 일본에서는 《산케이신문》이
《아사히신문》의 1/10 수준
⊙ 박근혜와 명성황후 비교 칼럼 쓴 노구치 히로유키 기자는 ‘별종’ 소리 듣는 《산케이》 내 强性
안보전문 기자
⊙ “낙서를 읽고 응답하는 한국 언론과 정부가 이상할 뿐”(한 일본 기자)
劉敏鎬
⊙ 54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일본 마쓰시타 정경숙 15기.
⊙ SBS 보도국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 연구소(RIETI) 연구원.
⊙ 現 워싱턴 ‘Pacific, Inc’ 프로그램 디렉터, 딕 모리스 선거컨설턴트 아시아 담당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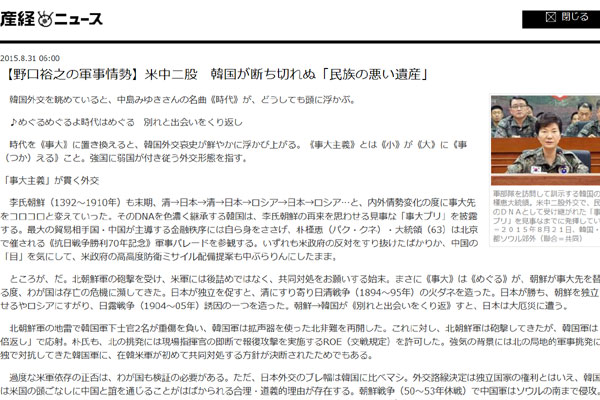
- 박근혜 대통령을 명성황후에 비유한 노부치 히로유키의 칼럼 ‘한국이 절대 끊을 수 없는 민족적 악습(米中二股,韓國が斷ち切れぬ民族の惡い遺産)’.
‘日 산케이, 박 대통령을 암살된 명성황후에 비유한 칼럼 파문’.
지난 8월 31일 한국 신문 방송이 보도한, 국민 모두의 혈압을 한순간 높아지게 만든 도쿄(東京)발 기사의 제목이다. 문제의 기사는 《산케이(産經)신문》(이하 《산케이》) 고정칼럼에 등장한 ‘미중 양다리 외교, 한국이 절대 끊을 수 없는 민족적 악습(米中二股,韓國が斷ち切れぬ民族の惡い遺産)’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산케이신문 정치부 전문위원으로 있는 노구치 히로유키(野口裕之)의 칼럼이다. 활자신문에 싣지 않고 인터넷에만 올린 기사다.
전체 내용은 조선 말의 상황을 기자 스스로의 개인적 역사관을 가지고 풀이한 것이다. 노구치의 글을 읽은 한국인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호(好), 불호(不好)를 떠나 아마도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분노했을 듯하다. 역사문제 이전에, 자신들이 살해한 한 나라의 황후를 현직 여성 대통령과 연결시킨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권위와 체면에 주목하는 유교주의에 기초한 분노가 아니다. 한국 신문의 칼럼에서 ‘현재의 일본 상황을 보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같은 최후를 아베, 아키히토(明仁)가 맞이하게 될 것’라고 한다면,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국가·역사·인간에 대한 無禮
 아마 그 글의 필자는 ‘명성황후=박 대통령’이라고 직접 표현한 적은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기자경력 30년 가까운 베테랑 논설위원이 자신의 글이 몰고 올 파문을 예상치 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필자는 일본인이 자의적으로 내린 조선 말 역사관에 대해 뭐라고 대응할 생각은 없다. 일본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언론자유의 나라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의가 느껴지는, 도(度)를 넘은, 최소한의 예(禮)를 잊은 칼럼이란 점이다. 글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가·역사·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무시한 저주다.
아마 그 글의 필자는 ‘명성황후=박 대통령’이라고 직접 표현한 적은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기자경력 30년 가까운 베테랑 논설위원이 자신의 글이 몰고 올 파문을 예상치 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필자는 일본인이 자의적으로 내린 조선 말 역사관에 대해 뭐라고 대응할 생각은 없다. 일본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언론자유의 나라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의가 느껴지는, 도(度)를 넘은, 최소한의 예(禮)를 잊은 칼럼이란 점이다. 글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가·역사·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무시한 저주다.
한국의 신문·방송은 노구치 칼럼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 글은 새삼스럽게 글의 내용을 다시 더듬고, 그 글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산케이》라는 매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점이다. 일본인에게 《산케이》가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논조와 내용의 매체인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주된 독자들인지 하는 점 말이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배경이나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간단하다. 《산케이》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한다면 앞으로 더더욱 거세질 ‘산케이 망언’에 대한 처방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은 세상의 흐름을 간단하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진 편리한 도구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검색어를 통한 여론탐사다.
한글 구글에 들어가 ‘산케이신문’이란 검색어를 집어넣어 보자. 무려 130만 건이 나온다. 일본 최고의 정론지 《아사히(朝日)신문》(이하 《아사히》)은 어떨까? 44만6000건 정도가 나온다. 《산케이》가 대략 3배 정도 더 많다. 일본어 구글에 들어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검색어를 넣어 보자. ‘산케이신문(産經新聞)’이 130만 건,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이 1270만 건이다. 일본에서는 산케이가 아사히의 10분의 1정도에 그친다.
이처럼 구글에 나타난 검색어 ‘단 하나’만으로도 《산케이》가 어떤 신문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일본인이 받아들이는 《산케이》의 위상은 《아사히》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이다. 한국에서의 위상은 거꾸로다. 《산케이》가 《아사히》보다 3배 정도 더 크다. 양적(量的)으로 볼 때, 한국인들은 《산케이》를 일본에서의 실제 위상에 비해 30배 정도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자국(自國)에서 벗어나 외국에서의 위상이 30배 정도에 달하는 신문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뉴욕타임스》를 구글 한글 검색어에 넣으면 147만 건으로, 《산케이》보다 조금 더 많을 뿐이다. 영어 구글에 NYT를 치면 무려 1억8800만 건이 뜬다. 검색어 수치만으로 본다면 한국에서의 《산케이》의 위상은 《뉴욕타임스》에 필적할 정도다. 한국에서 《산케이》를 둘러싼 버블(거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西日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문
구글 일본어 검색어에서 《산케이》가 《아사히》의 10분의 1에 머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사단법인 일본신문협회가 발간한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아사히》는 판매부수 650만 부를 기록하고 있다. 1위는 《요미우리(讀賣)신문》으로 900만 부를 조금 넘어선다. 《산케이》는 어떨까? 180만 부 정도다.
일본에는 5개의 전국지가 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 《마이니치(每日)신문》(360만 부)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290만 부), 그리고 《산케이》다. 4위에 비해 무려 110만 부 정도 적은, 최하위 수준의 전국지가 바로 《산케이》다.
좋은 물건만이 많이 팔리고 나쁜 물건은 안 팔린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일본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신문구독률이 높다. 100엔짜리 물건 하나를 살 때도 비교분석하는 소비자가 일본인이다. 선택하는 신문을 보면, 《산케이》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듯하다.
단지 판매부수라는 측면에서뿐 아니라, 《산케이》는 독자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전국지로서의 위상이 의문시되는 신문이다. 필자의 일본 내 지인(知人) 대부분은 도쿄 거주자들이다. 몇몇 지인에게 이 신문의 명성황후 기사와 관련해 물어봤지만, 대부분은 아예 보도를 접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반응했다. 인터넷판에 뜬 기사였기에 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평소에도 《산케이》는 만나기 어려운 ‘흔치 않은’ 존재다. 《산케이》는 도쿄 시민들이 거의 읽지 않는 신문이다. 다른 4개의 전국지 신문들과 달리 석간용 신문도 아예 없다.
《산케이》의 주된 기반은 오사카(大阪)와 나라(奈良)를 포함한 긴키 지방(近畿地方)에 그친다. 원래 《산케이》는 도쿄 이서(以西) 니시니혼(西日本) 지방에서 태어난 신문이다. 니시니혼을 기반으로 한 지역신문이었다가 1950년 전국지로 나선 것이다. 도쿄와 가나가와(神奈川)를 포함한 간토(關東)지방과 대도시의 경우 《요미우리》와 《아사히》가 대세다. 《산케이》는 명색은 전국지지만, 주된 판매지역을 보면 사실상 지역신문에 불과하다.
‘다테마에(建前) 혼내(本音)’라는 말을 일본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접하는 단어 중 하나일 것이다. 직설적으로 얘기하기보다 빙빙 둘러 간접적으로 알아듣도록 만드는 것이 ‘다테마에’, 사실을 사실대로 곧바로 말하는 것이 ‘혼내’다. 뜸을 들여 주변 공기(분위기)를 읽는 ‘네마와시(根回し)’를 통해 다테마에로 풀어 나가는 것이 일본문화의 특성 중 하나다. 《산케이》의 경우 다테마에보다 혼내를 전면에 내세우는 신문으로 알려져 있다. 좋게 말하면 화끈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막말 대장군이다. 이는 《산케이》 의 주된 기반인 오사카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도 통한다. 오사카 주민들은 화끈한 혼내의 캐릭터로 유명하다. 주된 독자의 캐릭터와 비슷한, 지역신문 수준의 미디어가 산케이의 현주소다.
《아사히》 공격으로 먹고사는 《산케이》
기사의 정확도나 칼럼의 깊이를 통해 본 《산케이》의 위상은 어떨까? 한국인들은 ‘《산케이》는 극우(極右)’라고 생각한다. 보통 일본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일본에서 공산주의, 천황 지지, 미일(美日)동맹, 적극외교는 좌(左)와 우(右)를 가르는 기준이다. 반공을 중심으로 하면서 천황을 지지하고, 미일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정치군사적 역할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이 ‘우’이다. 《산케이》는 그 같은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신문이다. 극좌(極左)에 해당하는 공산당 계열의 《아카하타(赤旗)》 같은 신문에 맞서는 전투형 미디어다. 냉전(冷戰) 당시에는 대만과 한국을 우방으로 여기고, 중공·소련을 적대시한 이념지(理念紙)이기도 하다. 21세기 들어 입장이 바뀌었지만, 1970년대 박정희(朴正熙) 정권 당시 한국을 가장 ‘사랑’한 신문이 《산케이》이다. 21세기 들어 ‘친한(親韓)’ 미디어로 나선 《아사히》와 《마이니치》는 당시에는 반한(反韓)에 앞장섰던 신문들이다.
《산케이》는 좌의 수장(首長)인 《아사히》를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존재이기도 하다. 좌성향의 사설이나 기사가 나오면 바로 다음 날 《산케이》가 공격한다. 다른 신문을 공격하는 것이 《산케이》의 주된 내용 중 하나다. 부수나 영향력 면에서 볼 때 《산케이》는 《아사히》에 맞설 만한 존재가 아니다. 《산케이》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사히》는 일언반구(一言半句) 대꾸도 하지 않는다. 《아사히》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자는 것이 《산케이》의 전략이다.
일본은 터부가 많은 사회다. 천황이나 야쿠자(ヤクザ)·기업·정치, 나아가 조선인 부라쿠(部落)에 관련한 터부가 많다. 서로간의 이해가 끈끈하게 이어진 상황에서 기사화하지 않거나, 못하는 부분이 많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3·11 동일본 대지진은 대표적인 본보기다. 정부·기업·지역 내 이익단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뭔가 시원한 목소리가 터지지 않았다.
《산케이》는 그 같은 진공(眞空)상태를 뚫고 나오는 미디어 역할을 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납치문제를 대북(對北) 외교카드로 내세운 것은 《산케이》의 후원에 힘입은 것이기도 하다.
“《산케이》 처음으로 야당전락”
《산케이》는 터부를 건드리는 과정에서 언론의 중립성을 넘어서는 신문으로 유명하다. 《산케이》 기자들의 행동지침이기도 한 ‘산케이신조(産經信條)’를 보면, ‘언론의 진실보도’를 강조할 뿐, ‘언론의 중립성’에 관한 언급이 아예 없다. 여기서 ‘진실’이란 말은 《산케이》가 주장하는 《산케이》만의 진실일 뿐이다. 진실과 이념은 종이 한장 차이다. 극단적으로 예기하자면, 《산케이》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을 위해서라면 중립성은 무시할 수 있는 신문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산케이》의 진실추구와 관련해 흥미로운 것은 ‘자민당 홍위병(紅衛兵)’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부분이다. 일본 언론 대부분이 친(親)자민당 성향인 것은 사실이다. 최고부수를 자랑하는 《요미우리》는 일본의 그 같은 분위기를 대변하는 좋은 증거다. 《아사히》가 좌의 수장이라고는 하지만, 내용을 보면 ‘반(反)자민당의 선봉’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산케이》의 경우 친자민당을 넘어서, 아예 ‘자민당의 홍보지’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 자민당이 패하자, 《산케이》 트위터에는 ‘《산케이》 처음으로 야당전락(産經新聞が初めて下野なう)’이란 글이 올라왔다. 《산케이》 스스로 ‘자민당 홍보지’였다는 것을 자인(自認)한 셈이다. 이 글은 당시 언론계에서 화제가 되었다. 《산케이》는 이후 민주당 정권 내내 ‘자민당 홍위병’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사사건건 민주당 정권을 물고 늘어졌다. 3·11 동일본 대지진 사건이 터졌을 때에는 민주당을 ‘무능한 국적(國賊)’으로 만드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다.
《산케이》와 아베 신조 총리의 관계는 무척 끈끈하다. 지난 8월 15일, 아베담화 전문(全文)을 가장 먼저 인터넷에 올린 곳도 《산케이》다. 자민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아베가 가려워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해 확실하게 서비스하는 곳이 《산케이》다.
‘구로다 가쓰히로’라는 인물
‘구글 오토필(Google Autofill)’은 세상사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조감도(鳥瞰圖)나 다름 없다. 특정 단어를 집어넣으면 곧바로 뒤에 자동적으로 다른 단어가 연결되는 식이다. 단어만이 아니라 문장도 나온다. ‘중국은 왜(Why does China)’라고 영어로 치면 ‘환율조작을 하는가(manipulate its currency)?’라는 말이 곧바로 이어진다.
한글 구글에 들어가 ‘산케이신문’이란 말을 치면 어떤 말이 이어질까? ‘지국장, 박근혜, 구로다 망언’이 이어진다. 이것이 한국인이 《산케이》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다.
주목할 부분은 ‘구로다’란 인물이다. 구로다는 《산케이》 서울지국의 특별기자로 일하는 구로다 가쓰히로(黑田勝弘) 씨를 말한다. 1941년생이다. 그와 한국의 인연은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기자의 해외 근무 기간은 보통 3~4년 정도다. 특정 국가에 36년간 머물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일본 언론사에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아닌까 싶다.
오토필에 나오는 단어 ‘망언’은 사실 구로다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불명예인지 명예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망언제조기’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한국 신문을 뒤지면, ‘구로다 망언’이란 타이틀하에 2012년 한 해만 해도 세 번의 사건이 터졌다.
‘매춘부를 국민대표로 삼는 한국.’(2012년 3월)
‘한류스타들은 한국에서의 인기 관리를 위해 반일·애국 퍼포먼스를 할 때가 있다… 인기인은 공식석상에서 정치적 언동을 지양해야 한다는 세계적 상식은 둘째 치더라도, (한류스타로서) 일본을 신경써야 하지 않느냐?’(2012년 2월)
‘일본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흑인 남자친구가 인기를 모은 게 언제였을까. 이것(한국 여성과 흑인 남성의 교제)도 일본 사회의 유행이나 사회현상을 뒤쫓는 한국의 일면일까?’(2012년 6월)
필자는 새삼 구로다 발언의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한국이 언론자유의 나라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증거로 받아들일 뿐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어떤 문제라도 기사화할 수 있다.
구로다와 같은 세계관으로 일본을 바라본다면, 필자는 양적·질적으로, 10배 100배에 해당하는 글을 매일 쓸 자신이 있다. 그 같은 얘기는 결코 생산적이지도 발전적이지도 않다. 스스로를 타락·퇴락시킬 뿐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옆이나 뒤에서 보면 어두운 부분이 있다. 어떤 나라나 사회도 완벽한 곳은 없다. 그러나 어둠이 아니라 밝은 세계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희망과 발전이 있다. 사실 필자는 구로다의 글을 망언이라 보지는 않는다. 어두운 면을 통해 우위의식을 갖고, 왜곡된 세계관으로 막장 세상에만 주목하는 낙서 정도로 해석할 뿐이다.
‘헨나 히토’
필자는 명성황후 관련 보도는 구로다 가쓰히로가 아닌, 도쿄 본사 기자가 쓴 글이란 점에 주목한다. 글을 쓴 노구치 기자는 원래 사회부 출신으로 규슈(九州)총국장을 거쳐 정치부로 진입한 인물이다. 안보·군사 전문가로, 1998년 북한 대포동 발사 실험과 관련 특종으로 신문협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통이 아니라, 전 세계 안보·외교를 다루는 과정에서 그 일환으로 한반도 상황을 이해할 뿐이다.
필자는 워싱턴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일본 기자들에게 노구치 기자에 대한 일반적 평판을 물어봤다. 5명 중 4명이 ‘헨나 히토(變な人)’라고 대답했다. ‘헨나 히토’란 ‘사교성에 바탕을 둔 통상적 대화가 어려운, 혼자만의 세계에 나서는 별종 오타쿠(オタク)’ 란 의미다. 이는 그가 쓰는 기사는 세계의 큰 흐름을 읽은 결과가 아니라, 그의 머리 속에서 해석되는 세상에 대한 기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장의 사람과 만나고 현지의 정보를 캐면서 발굴해 내는 기사가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외교와 안보가 그런 사람의 관심사의 전부다.
필자가 15년 워싱턴 생활을 통해 확인한 것이 있다. 영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미국인과의 대화나 파티에 무심한 기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다. 그들은 미국에 오기 전에 이미 채워진, 관념과 편견 속의 세계관으로 워싱턴과 글로벌 문제를 본다. 그들은 자료와 책을 보지만, 지금 움직이는 세상에 대한 생생한 정보가 없다. 화보 속의 모나리자를 보면서 다빈치를 분석하는 식이다. 그들에게는 파리 루브르박물관 마룻바닥에 서서 실물 모나리자를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박물관에서 어떤 식으로 모나리자를 관람하는지를 비교해 보려는 생각도 아예 없다. 아무리 고화질 4D 모나리자라도, 현장에서 느끼는 종합적 관점하의 모나리자를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책상 위에서나 통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CIA 음모론’ 등에 입각해 글로벌 정세를 분석한다.
“《산케이》 자체가 우성향이 강한 신문이지만, 노구치는 전쟁이나 무력(武力)대응도 마다하지 않는 《산케이》를 대표하는 우향우 강성파(タカ派)”라는 평판도 있다.
한국언론의 針小棒大도 문제
《월간조선》 2013년 10월호 ‘일본의 우경화와 미디어’란 기고문에서 밝혔지만, 과거 일본 언론의 흐름을 보면 21세기 《산케이》의 반한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있다. 1930년대 이후 중국·미국과의 전쟁에 접어들면서 일본 신문의 판매부수는 급증한다.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3사의 총발행부수를 보면, 1931년 400만부, 1937년 중일전쟁 때 700만부, 1941년 태평양전쟁 때 800만부로 올라간다. 시끄럽고 호전적(好戰的)인 분위기로 나아갈수록 세상사에 대한 관심사도 급증하는 법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산케이》의 한국 내 버블이 일본의 30배에 달한다는 사실은 구글 검색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수준의 신문에 정면대응하면서 관련기자를 구속하고, 정부 항의단을 보내는 것 자체가 노이즈 마케팅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우리 정부의 이런 대응은 자칫 잘못하면 외국에서는 민주주의 국가가 중시여기는, 언론자유에 반하는 행태로 보일 수 있다.
반일정서에 기초한, 한국언론의 침소봉대(針小棒大)형 자극성 기사도 《산케이》의 한국 내 위상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시끄럽게 짖는 개에게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
“‘변소간 낙서’에 불과”
‘무료(無料), 보수(保守), 싸다(安い), 혐한(嫌韓), 거짓말(?)…’
구글 일본어로 ‘《산케이》는 왜(産經新聞はなぜ)’를 넣으면 오토필로 뒤따르는 말이다. 일본 내에서 《산케이》의 위상이 어떤지 알 수 있는 증거들이다.
임진왜란과 정한론(征韓論)에서부터, 1970년대 좌파언론들의 박정희 정권 때리기와, 이어 21세기 나타난 《산케이》의 반한과 혐한…. 지나온 역사를 보면 일본은 자신의 위기나 치부(恥部)를 반한이나 혐한으로 가려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자체의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산케이》만이 아니라, 다른 미디어들의 반한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워싱턴 주재기자로 일한 적이 있는 한 일본기자의 충고는 그 같은 상황에 대응하는 정답처럼 느껴진다.
“무시하세요. 한층 더 관심을 끌려고 극단에서 극단으로 나아갈 겁니다. 계속해서 무시하세요. 해도 해도 관심을 못 끌면 자기들끼리 안에서 싸우면서 자멸하게 됩니다. 《산케이》는 신문이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를 가장한, 유머도 없고 아무도 읽지 않는 ‘변소간 종이(トイレペーパー )’위에 쓴 ‘변소간 낙서(トイレ落書き)’에 불과합니다. 가까이 가면 눈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코도 상합니다. 일본인들조차 무시하는데, 낙서를 읽고 응답하는 한국 언론과 정부가 이상할 뿐입니다.”⊙
지난 8월 31일 한국 신문 방송이 보도한, 국민 모두의 혈압을 한순간 높아지게 만든 도쿄(東京)발 기사의 제목이다. 문제의 기사는 《산케이(産經)신문》(이하 《산케이》) 고정칼럼에 등장한 ‘미중 양다리 외교, 한국이 절대 끊을 수 없는 민족적 악습(米中二股,韓國が斷ち切れぬ民族の惡い遺産)’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산케이신문 정치부 전문위원으로 있는 노구치 히로유키(野口裕之)의 칼럼이다. 활자신문에 싣지 않고 인터넷에만 올린 기사다.
전체 내용은 조선 말의 상황을 기자 스스로의 개인적 역사관을 가지고 풀이한 것이다. 노구치의 글을 읽은 한국인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호(好), 불호(不好)를 떠나 아마도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분노했을 듯하다. 역사문제 이전에, 자신들이 살해한 한 나라의 황후를 현직 여성 대통령과 연결시킨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권위와 체면에 주목하는 유교주의에 기초한 분노가 아니다. 한국 신문의 칼럼에서 ‘현재의 일본 상황을 보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같은 최후를 아베, 아키히토(明仁)가 맞이하게 될 것’라고 한다면,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국가·역사·인간에 대한 無禮
 아마 그 글의 필자는 ‘명성황후=박 대통령’이라고 직접 표현한 적은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기자경력 30년 가까운 베테랑 논설위원이 자신의 글이 몰고 올 파문을 예상치 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필자는 일본인이 자의적으로 내린 조선 말 역사관에 대해 뭐라고 대응할 생각은 없다. 일본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언론자유의 나라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의가 느껴지는, 도(度)를 넘은, 최소한의 예(禮)를 잊은 칼럼이란 점이다. 글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가·역사·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무시한 저주다.
아마 그 글의 필자는 ‘명성황후=박 대통령’이라고 직접 표현한 적은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기자경력 30년 가까운 베테랑 논설위원이 자신의 글이 몰고 올 파문을 예상치 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필자는 일본인이 자의적으로 내린 조선 말 역사관에 대해 뭐라고 대응할 생각은 없다. 일본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언론자유의 나라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의가 느껴지는, 도(度)를 넘은, 최소한의 예(禮)를 잊은 칼럼이란 점이다. 글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가·역사·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무시한 저주다.한국의 신문·방송은 노구치 칼럼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 글은 새삼스럽게 글의 내용을 다시 더듬고, 그 글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산케이》라는 매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점이다. 일본인에게 《산케이》가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논조와 내용의 매체인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주된 독자들인지 하는 점 말이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배경이나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간단하다. 《산케이》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한다면 앞으로 더더욱 거세질 ‘산케이 망언’에 대한 처방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은 세상의 흐름을 간단하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진 편리한 도구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검색어를 통한 여론탐사다.
한글 구글에 들어가 ‘산케이신문’이란 검색어를 집어넣어 보자. 무려 130만 건이 나온다. 일본 최고의 정론지 《아사히(朝日)신문》(이하 《아사히》)은 어떨까? 44만6000건 정도가 나온다. 《산케이》가 대략 3배 정도 더 많다. 일본어 구글에 들어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검색어를 넣어 보자. ‘산케이신문(産經新聞)’이 130만 건,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이 1270만 건이다. 일본에서는 산케이가 아사히의 10분의 1정도에 그친다.
이처럼 구글에 나타난 검색어 ‘단 하나’만으로도 《산케이》가 어떤 신문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일본인이 받아들이는 《산케이》의 위상은 《아사히》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이다. 한국에서의 위상은 거꾸로다. 《산케이》가 《아사히》보다 3배 정도 더 크다. 양적(量的)으로 볼 때, 한국인들은 《산케이》를 일본에서의 실제 위상에 비해 30배 정도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자국(自國)에서 벗어나 외국에서의 위상이 30배 정도에 달하는 신문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뉴욕타임스》를 구글 한글 검색어에 넣으면 147만 건으로, 《산케이》보다 조금 더 많을 뿐이다. 영어 구글에 NYT를 치면 무려 1억8800만 건이 뜬다. 검색어 수치만으로 본다면 한국에서의 《산케이》의 위상은 《뉴욕타임스》에 필적할 정도다. 한국에서 《산케이》를 둘러싼 버블(거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西日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문
구글 일본어 검색어에서 《산케이》가 《아사히》의 10분의 1에 머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사단법인 일본신문협회가 발간한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아사히》는 판매부수 650만 부를 기록하고 있다. 1위는 《요미우리(讀賣)신문》으로 900만 부를 조금 넘어선다. 《산케이》는 어떨까? 180만 부 정도다.
일본에는 5개의 전국지가 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 《마이니치(每日)신문》(360만 부)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290만 부), 그리고 《산케이》다. 4위에 비해 무려 110만 부 정도 적은, 최하위 수준의 전국지가 바로 《산케이》다.
좋은 물건만이 많이 팔리고 나쁜 물건은 안 팔린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일본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신문구독률이 높다. 100엔짜리 물건 하나를 살 때도 비교분석하는 소비자가 일본인이다. 선택하는 신문을 보면, 《산케이》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듯하다.
단지 판매부수라는 측면에서뿐 아니라, 《산케이》는 독자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전국지로서의 위상이 의문시되는 신문이다. 필자의 일본 내 지인(知人) 대부분은 도쿄 거주자들이다. 몇몇 지인에게 이 신문의 명성황후 기사와 관련해 물어봤지만, 대부분은 아예 보도를 접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반응했다. 인터넷판에 뜬 기사였기에 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평소에도 《산케이》는 만나기 어려운 ‘흔치 않은’ 존재다. 《산케이》는 도쿄 시민들이 거의 읽지 않는 신문이다. 다른 4개의 전국지 신문들과 달리 석간용 신문도 아예 없다.
《산케이》의 주된 기반은 오사카(大阪)와 나라(奈良)를 포함한 긴키 지방(近畿地方)에 그친다. 원래 《산케이》는 도쿄 이서(以西) 니시니혼(西日本) 지방에서 태어난 신문이다. 니시니혼을 기반으로 한 지역신문이었다가 1950년 전국지로 나선 것이다. 도쿄와 가나가와(神奈川)를 포함한 간토(關東)지방과 대도시의 경우 《요미우리》와 《아사히》가 대세다. 《산케이》는 명색은 전국지지만, 주된 판매지역을 보면 사실상 지역신문에 불과하다.
‘다테마에(建前) 혼내(本音)’라는 말을 일본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접하는 단어 중 하나일 것이다. 직설적으로 얘기하기보다 빙빙 둘러 간접적으로 알아듣도록 만드는 것이 ‘다테마에’, 사실을 사실대로 곧바로 말하는 것이 ‘혼내’다. 뜸을 들여 주변 공기(분위기)를 읽는 ‘네마와시(根回し)’를 통해 다테마에로 풀어 나가는 것이 일본문화의 특성 중 하나다. 《산케이》의 경우 다테마에보다 혼내를 전면에 내세우는 신문으로 알려져 있다. 좋게 말하면 화끈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막말 대장군이다. 이는 《산케이》 의 주된 기반인 오사카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도 통한다. 오사카 주민들은 화끈한 혼내의 캐릭터로 유명하다. 주된 독자의 캐릭터와 비슷한, 지역신문 수준의 미디어가 산케이의 현주소다.
《아사히》 공격으로 먹고사는 《산케이》
기사의 정확도나 칼럼의 깊이를 통해 본 《산케이》의 위상은 어떨까? 한국인들은 ‘《산케이》는 극우(極右)’라고 생각한다. 보통 일본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일본에서 공산주의, 천황 지지, 미일(美日)동맹, 적극외교는 좌(左)와 우(右)를 가르는 기준이다. 반공을 중심으로 하면서 천황을 지지하고, 미일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정치군사적 역할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이 ‘우’이다. 《산케이》는 그 같은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신문이다. 극좌(極左)에 해당하는 공산당 계열의 《아카하타(赤旗)》 같은 신문에 맞서는 전투형 미디어다. 냉전(冷戰) 당시에는 대만과 한국을 우방으로 여기고, 중공·소련을 적대시한 이념지(理念紙)이기도 하다. 21세기 들어 입장이 바뀌었지만, 1970년대 박정희(朴正熙) 정권 당시 한국을 가장 ‘사랑’한 신문이 《산케이》이다. 21세기 들어 ‘친한(親韓)’ 미디어로 나선 《아사히》와 《마이니치》는 당시에는 반한(反韓)에 앞장섰던 신문들이다.
《산케이》는 좌의 수장(首長)인 《아사히》를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존재이기도 하다. 좌성향의 사설이나 기사가 나오면 바로 다음 날 《산케이》가 공격한다. 다른 신문을 공격하는 것이 《산케이》의 주된 내용 중 하나다. 부수나 영향력 면에서 볼 때 《산케이》는 《아사히》에 맞설 만한 존재가 아니다. 《산케이》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사히》는 일언반구(一言半句) 대꾸도 하지 않는다. 《아사히》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자는 것이 《산케이》의 전략이다.
일본은 터부가 많은 사회다. 천황이나 야쿠자(ヤクザ)·기업·정치, 나아가 조선인 부라쿠(部落)에 관련한 터부가 많다. 서로간의 이해가 끈끈하게 이어진 상황에서 기사화하지 않거나, 못하는 부분이 많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3·11 동일본 대지진은 대표적인 본보기다. 정부·기업·지역 내 이익단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뭔가 시원한 목소리가 터지지 않았다.
《산케이》는 그 같은 진공(眞空)상태를 뚫고 나오는 미디어 역할을 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납치문제를 대북(對北) 외교카드로 내세운 것은 《산케이》의 후원에 힘입은 것이기도 하다.
 |
| 아베 총리의 당선을 다룬 2012년 12월 26일자 《산케이신문》 호외.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 등 자민당과 밀접한 관계다. |
《산케이》의 진실추구와 관련해 흥미로운 것은 ‘자민당 홍위병(紅衛兵)’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부분이다. 일본 언론 대부분이 친(親)자민당 성향인 것은 사실이다. 최고부수를 자랑하는 《요미우리》는 일본의 그 같은 분위기를 대변하는 좋은 증거다. 《아사히》가 좌의 수장이라고는 하지만, 내용을 보면 ‘반(反)자민당의 선봉’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산케이》의 경우 친자민당을 넘어서, 아예 ‘자민당의 홍보지’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 자민당이 패하자, 《산케이》 트위터에는 ‘《산케이》 처음으로 야당전락(産經新聞が初めて下野なう)’이란 글이 올라왔다. 《산케이》 스스로 ‘자민당 홍보지’였다는 것을 자인(自認)한 셈이다. 이 글은 당시 언론계에서 화제가 되었다. 《산케이》는 이후 민주당 정권 내내 ‘자민당 홍위병’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사사건건 민주당 정권을 물고 늘어졌다. 3·11 동일본 대지진 사건이 터졌을 때에는 민주당을 ‘무능한 국적(國賊)’으로 만드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다.
《산케이》와 아베 신조 총리의 관계는 무척 끈끈하다. 지난 8월 15일, 아베담화 전문(全文)을 가장 먼저 인터넷에 올린 곳도 《산케이》다. 자민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아베가 가려워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해 확실하게 서비스하는 곳이 《산케이》다.
‘구로다 가쓰히로’라는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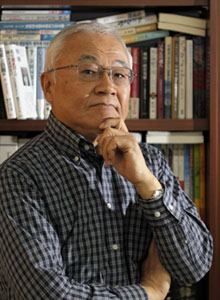 |
|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특별기자. 사진=조선일보DB |
한글 구글에 들어가 ‘산케이신문’이란 말을 치면 어떤 말이 이어질까? ‘지국장, 박근혜, 구로다 망언’이 이어진다. 이것이 한국인이 《산케이》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다.
주목할 부분은 ‘구로다’란 인물이다. 구로다는 《산케이》 서울지국의 특별기자로 일하는 구로다 가쓰히로(黑田勝弘) 씨를 말한다. 1941년생이다. 그와 한국의 인연은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기자의 해외 근무 기간은 보통 3~4년 정도다. 특정 국가에 36년간 머물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일본 언론사에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아닌까 싶다.
오토필에 나오는 단어 ‘망언’은 사실 구로다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불명예인지 명예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망언제조기’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한국 신문을 뒤지면, ‘구로다 망언’이란 타이틀하에 2012년 한 해만 해도 세 번의 사건이 터졌다.
‘매춘부를 국민대표로 삼는 한국.’(2012년 3월)
‘한류스타들은 한국에서의 인기 관리를 위해 반일·애국 퍼포먼스를 할 때가 있다… 인기인은 공식석상에서 정치적 언동을 지양해야 한다는 세계적 상식은 둘째 치더라도, (한류스타로서) 일본을 신경써야 하지 않느냐?’(2012년 2월)
‘일본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흑인 남자친구가 인기를 모은 게 언제였을까. 이것(한국 여성과 흑인 남성의 교제)도 일본 사회의 유행이나 사회현상을 뒤쫓는 한국의 일면일까?’(2012년 6월)
필자는 새삼 구로다 발언의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한국이 언론자유의 나라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증거로 받아들일 뿐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어떤 문제라도 기사화할 수 있다.
구로다와 같은 세계관으로 일본을 바라본다면, 필자는 양적·질적으로, 10배 100배에 해당하는 글을 매일 쓸 자신이 있다. 그 같은 얘기는 결코 생산적이지도 발전적이지도 않다. 스스로를 타락·퇴락시킬 뿐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옆이나 뒤에서 보면 어두운 부분이 있다. 어떤 나라나 사회도 완벽한 곳은 없다. 그러나 어둠이 아니라 밝은 세계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희망과 발전이 있다. 사실 필자는 구로다의 글을 망언이라 보지는 않는다. 어두운 면을 통해 우위의식을 갖고, 왜곡된 세계관으로 막장 세상에만 주목하는 낙서 정도로 해석할 뿐이다.
 |
| 노구치 히로유키 《산케이신문》 기자. 사진=유튜브 캡처 |
필자는 워싱턴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일본 기자들에게 노구치 기자에 대한 일반적 평판을 물어봤다. 5명 중 4명이 ‘헨나 히토(變な人)’라고 대답했다. ‘헨나 히토’란 ‘사교성에 바탕을 둔 통상적 대화가 어려운, 혼자만의 세계에 나서는 별종 오타쿠(オタク)’ 란 의미다. 이는 그가 쓰는 기사는 세계의 큰 흐름을 읽은 결과가 아니라, 그의 머리 속에서 해석되는 세상에 대한 기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장의 사람과 만나고 현지의 정보를 캐면서 발굴해 내는 기사가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외교와 안보가 그런 사람의 관심사의 전부다.
필자가 15년 워싱턴 생활을 통해 확인한 것이 있다. 영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미국인과의 대화나 파티에 무심한 기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다. 그들은 미국에 오기 전에 이미 채워진, 관념과 편견 속의 세계관으로 워싱턴과 글로벌 문제를 본다. 그들은 자료와 책을 보지만, 지금 움직이는 세상에 대한 생생한 정보가 없다. 화보 속의 모나리자를 보면서 다빈치를 분석하는 식이다. 그들에게는 파리 루브르박물관 마룻바닥에 서서 실물 모나리자를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박물관에서 어떤 식으로 모나리자를 관람하는지를 비교해 보려는 생각도 아예 없다. 아무리 고화질 4D 모나리자라도, 현장에서 느끼는 종합적 관점하의 모나리자를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책상 위에서나 통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CIA 음모론’ 등에 입각해 글로벌 정세를 분석한다.
“《산케이》 자체가 우성향이 강한 신문이지만, 노구치는 전쟁이나 무력(武力)대응도 마다하지 않는 《산케이》를 대표하는 우향우 강성파(タカ派)”라는 평판도 있다.
한국언론의 針小棒大도 문제
《월간조선》 2013년 10월호 ‘일본의 우경화와 미디어’란 기고문에서 밝혔지만, 과거 일본 언론의 흐름을 보면 21세기 《산케이》의 반한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있다. 1930년대 이후 중국·미국과의 전쟁에 접어들면서 일본 신문의 판매부수는 급증한다.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3사의 총발행부수를 보면, 1931년 400만부, 1937년 중일전쟁 때 700만부, 1941년 태평양전쟁 때 800만부로 올라간다. 시끄럽고 호전적(好戰的)인 분위기로 나아갈수록 세상사에 대한 관심사도 급증하는 법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산케이》의 한국 내 버블이 일본의 30배에 달한다는 사실은 구글 검색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수준의 신문에 정면대응하면서 관련기자를 구속하고, 정부 항의단을 보내는 것 자체가 노이즈 마케팅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우리 정부의 이런 대응은 자칫 잘못하면 외국에서는 민주주의 국가가 중시여기는, 언론자유에 반하는 행태로 보일 수 있다.
반일정서에 기초한, 한국언론의 침소봉대(針小棒大)형 자극성 기사도 《산케이》의 한국 내 위상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시끄럽게 짖는 개에게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
“‘변소간 낙서’에 불과”
‘무료(無料), 보수(保守), 싸다(安い), 혐한(嫌韓), 거짓말(?)…’
구글 일본어로 ‘《산케이》는 왜(産經新聞はなぜ)’를 넣으면 오토필로 뒤따르는 말이다. 일본 내에서 《산케이》의 위상이 어떤지 알 수 있는 증거들이다.
임진왜란과 정한론(征韓論)에서부터, 1970년대 좌파언론들의 박정희 정권 때리기와, 이어 21세기 나타난 《산케이》의 반한과 혐한…. 지나온 역사를 보면 일본은 자신의 위기나 치부(恥部)를 반한이나 혐한으로 가려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자체의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산케이》만이 아니라, 다른 미디어들의 반한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워싱턴 주재기자로 일한 적이 있는 한 일본기자의 충고는 그 같은 상황에 대응하는 정답처럼 느껴진다.
“무시하세요. 한층 더 관심을 끌려고 극단에서 극단으로 나아갈 겁니다. 계속해서 무시하세요. 해도 해도 관심을 못 끌면 자기들끼리 안에서 싸우면서 자멸하게 됩니다. 《산케이》는 신문이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를 가장한, 유머도 없고 아무도 읽지 않는 ‘변소간 종이(トイレペーパー )’위에 쓴 ‘변소간 낙서(トイレ落書き)’에 불과합니다. 가까이 가면 눈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코도 상합니다. 일본인들조차 무시하는데, 낙서를 읽고 응답하는 한국 언론과 정부가 이상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