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恩亨
⊙ 63세. 조선대 법학과 졸업. 中옌볜대 대학원 석사(동북아 및 고대 조선), 현재 옌볜대 박사과정.
⊙ 연합뉴스 기자, 同 광주전남취재본부장 역임. 現 중국 옌볜대 조선역사연구소 객원연구원.
⊙ 논문: <고죽국 연구> <신패수고> 등.
⊙ 63세. 조선대 법학과 졸업. 中옌볜대 대학원 석사(동북아 및 고대 조선), 현재 옌볜대 박사과정.
⊙ 연합뉴스 기자, 同 광주전남취재본부장 역임. 現 중국 옌볜대 조선역사연구소 객원연구원.
⊙ 논문: <고죽국 연구> <신패수고> 등.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大)’자를 무척 좋아한다. 작게는 인명이나 회사명부터 크게는 국호를 비롯한 각종 기관명에 ‘대’를 많이 쓰고 있다.
사실 ‘대’자는 부사, 명사, 동사로도 일부 쓰이나 주로 형용사로 쓰인다. 대인(大人), 대사건(大事件), 대홍수(大洪水), 대주주(大株主), 대왕(大王), 대기록(大記錄), 대참사(大慘事), 대공원(大公園), 대역사(大役事), 대의(大義) 등으로 말이다.
영어권에서도 ‘대’에 해당하는 ‘big’이나 ‘large’, ‘huge’, ‘great’를 주로 형용사로 쓴다. 빅세일(Big Sale), 빅뱅(Big Bang), 중요인물(a big man), 위인(a great man), 몸집이 큰 사람(a large man), 거인(a huge man), 대기업(a large company) 등등….
이들 단어가 고유명사를 구성하는 예는 오대호(Great Lakes)와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Great Victoria Desert) 등 일부 지명에 불과하고 인명이나 상호명, 기관명에는 거의 없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를 좋아하지만 인명에 대해서는 대자를 넣어 쓰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지 ‘대’ 대신 같은 의미인 ‘태(泰)’를 더 많이 쓴다. 요즈음에는 아름이, 보람이, 한별이, 초롱이, 하나, 한나 등 한글 이름도 많지만 1990년 이전 주로 한자 이름을 쓰던 세대 출생자들에게는 ‘대’와 ‘태’자가 많다. 필자 주변 지인만으로도 대희, 대성, 대수, 대진, 대호, 대업, 성대, 승대와 성태, 영태, 주태, 태수, 태권, 태영, 태주 등 수두룩하다.
우리가 대나 태를 좋아하는 정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쉬운 방법으로 동북아 한자권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다.(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이름에 대자가 있는 의원은 경대수(慶大秀·이하 경칭생략) 등 6명이고 태자를 쓴 의원은 김성태(金聖泰) 등 9명이다.
중국은 177명의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 가운데 대와 태자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고, 중화민국(타이완)도 국회의원(입법위원) 113명 가운데 2명이 있다. 일본은 중의원 479명 가운데 9명,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가운데 17명이 있다. 나라별 점유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5.0%로 중국 1.1%, 타이완 1.8%, 일본 1.9%, 북한 2.5%에 비해 배 이상이다.
성서 인물 이름이 인기인 구미
구미의 경우 구조적으로 ‘대’에 해당하는 big, large, huge, great 등을 넣어 이름을 짓기 곤란하다. 좋다거나 훌륭하다는 뜻인 good, fine, nice 등 어떤 목적이나 의미가 있는 형용사들도 넣어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구미인들은 유명한 왕이나 신화 속 인물, 조상(祖上), 성서에 나오는 인물 등에서 차용해 이름을 짓는 사람이 많다.
영국이나 미국 등 영어권에서 많이 쓰는 15대 이름은 존(John), 데이비드(David), 제임스(James), 스티븐(Stephen, Steven), 윌리엄(William), 로버트(Robert), 조지(George), 피터(peter), 마이클(Michael), 토머스(Thomas), 폴(Paul), 필립(Philip), 애덤(Adam), 리처드(Richard), 요셉(Joseph), 찰스(Charles), 에드워드(Edward) 등이다.
현 미국 하원 435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쓰고 있는 이름은 존(20명), 제임스(15명), 스티븐(14명), 데이비드(10명), 윌리엄(10명)이며 영국 하원(649명) 가운데에는 데이비드(33명), 존(23명), 스티븐(21명), 제임스(19명), 폴(11명) 등이다. 이들 이름은 영어권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등의 언어권에서도 두루 쓰인다.
예를 들어 존은 프랑스어로 장(Jean), 네덜란드어로 얀(Jan), 독일어로 요한(Johann), 러시아어로 이반(Ivan), 스페인어로 후안(Juan), 포르투갈어로 주앙(Joao)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피터는 프랑스어로 피에르(Pierre), 러시아어로 표트르(Pyotr, Pe tr), 스페인어로 페드로(Pedro), 이탈리아어로 피에트로(Pietro), 포르투갈어로 페드루(Pedro) 등으로 불린다. 이들 15대 이름들의 유래를 따져보면 로버트와 윌리엄, 리처드, 찰스, 에드워드 등 5개 이름은 유명한 왕들의 이름이었고 나머지 10개 이름은 성서에 나오거나 기독교와 관계된 인물들의 이름이었다.
중세(927~1087년) 노르망디 공작의 경우 윌리엄 1세, 리처드 1세, 리처드 2세, 리처드 3세, 로버트 1세, 윌리엄 2세 순으로 이어졌다. 찰스와 에드워드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이자 프랑크의 왕인 찰스 1세(742~814)와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1003~1066) 등이 있다.
성서에서 빌려온 인명인 존의 경우 요한(John)의 영어식 이름으로 예수에게 세례를 준 선지자 ‘세례 요한’과 예수의 제자로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쓴 것으로 알려진 ‘사도 요한’이 유명하다. 성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지만 후대에는 거의 쓰지 않는 이름이 있다. 유다(Judas)다. 예수의 제자였으나 예수를 팔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자이다.
성서에는 그를 가롯유다(Judas Iscariot)로 기록했는데 예수의 12제자 중에는 가롯 유다 말고도 ‘유다 도마’, ‘유다 다대오’ 등이 있었으며 예수의 막내동생(넷째) 이름 역시 유다였다. 그러나 흔했던 유다라는 이름은 가롯 유다로 인해서인지 그 뒤 쓰는 사람이 극히 적다. ‘이스가리옷(Iscariot)’은 이후 배반자 또는 모반자라는 명사로도 쓰이고 있다.
몸 낮춘 고대 제후들의 자칭어(自稱語)
예부터 동양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호칭을 사용해 ‘대’자 자체를 이름에 쓰기에 버거운 문자로 생각했다. 대인은 소아(小兒)의 반대말로 어른(成人)이라는 뜻도 있지만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했으며 자신은 소인(小人), 소생(小生), 소관(小官), 소장(小將) 등으로 낮춰 부르는 관습이 아직도 남아 있다.
자신을 낮춘 것은 왕이나 제후들도 마찬가지였다. 예부터 임금들은 자신을 여(余, 予), 고(孤), 과인(寡人), 불곡(不穀), 짐(朕) 등으로 불렀다. 이들 명칭은 모두 중국 춘추전국시대(기원전 770~221)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나 과인은 왕이나 군주들 또는 일부 사대부들이 두루 사용했으며 ‘저’와 비슷한 겸양어였다.
처음부터 일반인이 아닌 왕이나 제후들이 자신을 부르는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 고와 불곡이다. 고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신하나 백성들은 몰려다니는 데 반해 제왕은 일반인이 감히 주변에 가까이 오지 못해 마치 혼자 외롭게 있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라는 풀이다. 불곡은 ‘좋은 사람이 못된다’는 겸양어다. 곡(穀)은 곡식 외에 선(善)이라는 뜻이 있으며 선 역시 ‘착하다’는 뜻 외에 ‘호인(好人)’이나 ‘길(吉)하다’는 뜻도 있어 불곡은 ‘착하거나 길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짐은 진시황(秦始皇)이 처음 사용한 뒤 역대 황제나 제왕들이 사용하는 자칭어로 정착됐다. 그러나 짐은 진시황이 쓰기 이전부터 일반에 이미 널리 쓰이던 명칭이었다. 일반 평민이나 노예까지 두루 쓰던 말로 ‘나’를 뜻했다.
상호(商號)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대를 많이 쓴다. 우리나라 2011년 매출액 순위 100대 기업 가운데 대자가 들어간 기업은 대우인터내셔널 등 7개, 도급순위 100위 건설업체 가운데는 대림건설 등 10개나 된다. 중국 100대 기업과 일본과 타이완의 상장 매출순위 100대 기업 가운데 대자가 들어간 기업은 각각 3개씩이다. 역시 우리나라 기업이 이들 나라보다 2배 이상 많다. 영어권은 인명과 마찬가지로 상호에 ‘big’ 등 ‘대’와 같은 의미의 문자는 쓰지 않는다.
중국자전(中國字典)에 “‘대’는 갑골문에 나오는 오래된 자로 소(小)의 반대말이며 ‘사지를 쭉 편 인형(四肢伸展的人形)’이나 ‘엄숙하고 단정하게 앉아 있는 통치자(危襟正坐的統治者) 형상’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옛날에 크다는 것을 두 손과 두 발을 한껏 벌려 표현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위엄 있는 통치자가 앉아 있는 것도 크게 느꼈을 것이다.
대는 크다는 것 외에 경지가 넓고(廣) 정도가 깊고(深) 성질이 중요(重要)하다는 뜻도 있다. 대와 같은 뜻의 한자어로 앞서 말한 태(泰)와 함께 태(太), 호(昊), 거(巨), 위(偉), 환(桓)이 있다.
세계 유일 ‘大’로 시작하는 국호
우리나라 국호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대로 시작한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자를 국호에 쓰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영국의 경우 그레이트 브리튼(Great Britain)이라고 그레이트(great)가 들어가지만 이는 잉글랜드(England), 웨일스(Wales), 스코틀랜드(Scotland)를 망라한 영국의 본토 ‘그레이트 브리튼 섬’을 뜻한다. 영국의 공식명칭은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다.
이와 관련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는 대영박물관(大英博物館·The British Museum)도 그냥 영국박물관(英國博物館)이나 국립 영국박물관으로 고쳐 번역해야 맞을 것 같다.
대한이라는 국호가 처음 등장한 것은 조선조 말인 1897년이다. 조선 왕이던 고종이 원구단을 만들어 황제 즉위식을 갖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꿨다. 나라 이름에 ‘대’를 넣고 황제를 자칭한 것이다. 당시 국호는 고종과 대신들의 논의에서 확정되었는데 ‘대한’으로 정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 등 삼한을 아우른 것이니 큰 한(韓), 곧 대한이라는 이름이 적합하고, 조선은 옛날 기자(箕子)가 봉(封)해졌을 때의 이름이니 당당한 제국의 명칭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대한’의 한은 크다 또는 영수(領袖), 왕 등을 뜻하는 한(汗)과 같은 음이다. 신채호(申采浩) 등 일부 학자들은 한(韓)은 한(汗)과 같은 뜻이고 신라시대 왕의 칭호인 거서간(居西干)과 마립간(麻立干)의 간(干)도 같은 뜻으로 해석했다. 중국자전에 따르면 한(汗) 또는 가한(可汗)은 고대 선비(鮮卑), 유연(柔然), 돌궐(突厥), 회흘(回紇), 몽고(蒙古)족 등의 족장이나 통치자(왕)의 명칭이며 대한(大汗)은 황제 또는 제왕을 뜻한다.
예를 들어 원 제국을 세운 몽고의 테무친(鐵木眞)은 제호(帝號)가 칭기즈 칸으로 한자 표기로는 청지스한(成吉思汗)인데 이는 몽고제국(蒙古帝國)의 대한(大汗)이자 ‘전 세계의 군주’라는 뜻이다.
이 같은 명칭은 중국 최후의 왕조인 청나라까지 이어져 황제들의 명칭을 ‘한’이나 ‘칸’으로 썼다. 옹정제(雍正帝)의 경우 만주어로는 후왈리야순 톱 한(Huwaliyasun Tob Han), 몽골어로는 나이랄트 퇴브 칸(Nairalt Tov Khaan)이라 불렸다. 한(汗)과 한(韓)이 같이 쓰였다는 것은 중국 역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북위(北魏) 효문제(孝文帝) 때 선비족(鮮卑族) ‘추다한(出大汗)’이 ‘한(韓)’과 ‘한(汗)’이 같은 음이라는 이유로 성씨를 한(韓)으로 했으며 명(明) 때 간쑤성(甘肅省) 린샤(臨夏)의 ‘거한(可汗)’도 ‘한(韓)’을 성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일부 학자들은 ‘대한’은 크다는 뜻의 ‘한(韓)’에 대(大)가 중복된 명칭으로 풀이한다. 대한을 ‘더할 나위 없이 크고 큰 나라(大大)’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다.
無邊廣大한 우주를 품은 태극기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太極旗)다. 태극기의 기원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인식 전인 5월 14일 미국 전권대사였던 스와타라(Swatara)호 함장 슈펠트(Robert W. Shufeldt)가 조선 전권대신인 신헌(申櫶)과 김홍집(金弘集)에게 ‘조인식에 국기를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김홍집이 역관 이응준(李應浚)에게 국기 제작을 지시해 만들어졌다.
이 기는 제물포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게양됐다. 이 국기의 형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확한 기록이 없어 ‘괘가 없는 태극기’나 ‘팔괘 태극기’로 추정돼 왔으나 이 조약 체결 2개월 뒤인 7월 19일 미국 해군부가 제작한 도서 《해양 국가들의 기》에 태극기가 실려 있는 것이 2008년 밝혀져 이 기가 이응준이 제작한 것으로 학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 기는 4괘의 위치와 태극 문양이 약간 다르지만 현재의 태극기와 전체적인 모습이 흡사하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흰색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나타낸다. 태극 문양의 파랑과 빨강은 음(陰)과 양(陽)의 조화를, 4괘는 음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태극기의 원형은 태극의 철학 사상을 원리로 하는 ‘태극 8괘’를 기초로 한 것이다.
중국 《역경(易經)》의 ‘계사전(繫辭傳)’에서는 태극을 음·양의 근원이자 통일체로 보고 태극에서 양의(兩義), 4상(四象), 8괘(八卦)가 차례로 생겼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태극에서 음양(兩儀)이 생기고 음양이 춘하추동(四象)으로 발전하고 춘하추동이 하늘과 땅 등 모든 우주 만물(八卦)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8괘는 음(--)과 양(—)의 결합·교감함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건(乾)·곤(坤)·진(震)·손(巽)·감(坎)·이(離)·간(艮)·태(兌)로 표시하며 각각 하늘(天)·땅(地)·우레(雷)·바람(風)·물(水)·불(火)·산(山)·연못(澤)의 8가지 자연현상을 뜻한다.
우리 태극기는 태극 8괘 그림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45도 이동시켜 8괘 가운데 4괘만 표시하고 태극 문양의 회전 방향도 반대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태극기 문양에 대해 상당기간 구설수가 뒤따랐었다. 광복 후 국토가 남북으로 갈린 것에 대해 “좌우 대칭인 태극의 문양을 상하 대칭으로 바꿔 그린 태극기 때문에 남북 분단이 발생했다”는 말이 일부 호사가들에 의해 항간에 나돌았다. 또 “태극을 위는 붉은색, 아래는 파란색으로 그리면서 붉은색이 45도 서쪽(왼쪽)으로 기울어지게 해 붉은색(북)이 파란색(남)을 침범하게 돼 있다”며 “북의 침략으로 6·25전쟁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도 있었다. 이와 함께 “전쟁으로 인해 남북의 경계가 태극 모양으로 변하게 됐다”는 말도 함께 퍼졌다. 이는 직선이던 38선이 휴전 뒤 동쪽은 북으로 올라간 반면, 서쪽은 남으로 처진 휴전선으로 대체되자 더욱 그럴듯하게 퍼져 나갔다.
세계 각국의 국기는 삼색기(三色旗)가 주류를 이룬다. 삼색기는 3가지 색만으로 3등분된 기를 말한다. 유럽에서는 46개국 가운데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등 22개국의 국기가 삼색기다. 세계적으로는 68개국이 삼색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삼색기는 주로 푸른색, 흰색, 빨간색, 녹색으로 구성됐으나 나라마다 의미는 각각 다르다.
네덜란드 국기는 빨강은 용기를, 흰색은 신앙을, 파랑은 충성을 상징하지만 러시아 국기는 흰색은 고귀함과 진실·고상함·솔직·자유·독립을, 파랑은 정직·헌신·순수·충성을, 빨강은 용기·사랑·자기희생을 나타낸다. 다른 나라 국기들도 모양은 다르지만 대부분 자유나 평등, 평화, 사랑, 정직, 혁명, 신앙, 태양, 십자가 등 단순한 뜻을 상징하는 색깔이나 무늬로 구성돼 있다. 크고 넓은 우주의 생성·변환 원리를 담은 태극 8괘를 근간으로 만든 태극기는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영원을 꿈꾸지만 진취성 부족한 애국가
우리의 나라노래 애국가를 보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은 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한대(無限大)다. 그러나 가사의 내용을 보면 큰 뜻을 이루겠다는 진취적인 기상이나 국력이 사해에 떨치게 해달라는 능동적인 기원은 없다. 속된 말로 “인생을 짧고 굵게 살 것이냐” 아니면 “가늘고 길게 살 것이냐”는 물음에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는 대답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나라의 노래인 만큼 “굵고 길게 살고 싶다”는 내용이 담기길 바라는 것이 욕심일까?
다른 나라 국가를 보자.
중국의 국가는 ‘의용군 진행곡’으로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여! 우리의 피와 살로 새로운 만리장성을 세우자!…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적군의 포화를 용감히 뚫고, 전진하자! 전진하자! 나가자!”이다.
타이완의 국가는 ‘삼민주의(三民主義)’로 “삼민주의는 우리의 근본… 아 그대들이여, 민족을 위해 선봉에 서라… 한마음 한뜻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뜻을 이루자”는 내용이다.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君が代)’의 가사는 “임(君·일본 천황)의 치세는 천 대에 팔천 대에 작은 조약돌이 큰 바위가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다.
영국의 국가는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God Save the Queen)’로 “신이여 자비로운 우리 여왕을 구하소서… 여왕의 적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패망하게 하소서. 그들의 책략을 깨뜨리시고 악랄한 흉계를 헛되게 하소서…”로 되어 있다.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는 “가자 조국의 아들들아 영광의 날이 왔다!… 무장하라, 시민들이여 무리를 지어라. 행진하자, 행진하자! 불순한 피가 우리의 밭을 적실 때까지!”다.
미국 국가 ‘성조기여 영원하라’는 “… 우리를 감싸는 성조기는 치열한 전투 중 우리가 사수한 성벽 위에서도 의연히 나부끼고 있었다. 붉게 타오르며 작렬하는 포화와 치열한 폭탄 속에서도 우뚝 서 있음을 우리는 보았다…”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모두 전쟁과 피비린내가 난다. 자유, 독립이나 적에 대한 승리 등을 위한 결연한 의지도 담고 있다.
단지 일본의 국가가 왕의 치세가 오래가길 염원하는 내용이어서 일견 우리 애국가의 ‘영원무궁토록 보존해 달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영원에 대한 표현이 우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고 일본은 ‘조약돌이 큰 바위가 되기까지’로 다르다. 우리는 신에 현상 그대로의 보존을 바라는 것이라면 일본은 무언가 조성되어 변화되는 가운데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바라는 뜻이어서 다르다.
매일 지고 피는 無窮한 꽃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無窮花)는 어떤가?
무궁은 끝이 없는 크고 광대무변(廣大無邊)하다는 뜻이다. 역시 대자가 연상되는 이름이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지만 다음 날에는 다른 가지에서 또 꽃을 피우는 무궁화는 7월부터 10월까지 100여 일을 매일 피고 지는 생명력이 강한 꽃이다. 무궁화는 중국어 목근화(木槿花)의 발음 ‘무진화’에 대한 취음(取音) 표기로 보는 사람이 많다. ‘무궁화’로 불린 것은 조선시대 이후로, 그 이전에는 각종 기록에 ‘목근(木槿)’ 또는 ‘근화(槿花)’, ‘순(舜)’ 등으로 불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와 무궁화의 인연은 오래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기원전 3세기 이전에 저술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고서(古書) 《산해경(山海經)》의 ‘해외동경(海外東經)’ 편에 “군자의 나라에 훈화초가 있는데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君子之國有薰華草朝生夕死)”고 되어 있다. 군자의 나라는 옛 고조선이나 삼한을, 훈화(薰華)는 순화(舜華)와 함께 무궁화의 옛 이름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서 목근화나 순화 등으로 부르는 꽃을 우리는 무궁화라고 부르는 것은 무궁이라는 글자를 선호한 국민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무궁 역시 대(大)와 통하기 때문이다.
대자로 시작하는 국가기관… 대통령
우리나라 국가수반은 대통령이다. 대통령 역시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명칭이다. 중국의 국가 원수는 국가주석이다. 실질적인 정치권력을 갖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겸하고 있다. 입헌 군주국인 일본은 국가 원수가 왕(天皇)이며 정부 수반은 내각총리대신이다. 타이완은 총통이며, 한자권이었던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도 주석이다.
일반적으로 영어권은 대통령 중심제의 경우 프레지던트(President), 내각책임제의 경우 프라임 미니스터(Prime minister)이다. 프레지던트는 국가원수에게만 쓰이는 말이 아니다. 회사의 사장이나 부장, 대학 총·학장, 회의장의 의장, 사회자 등에게 보편적으로 붙인 명칭이며 미국의 국가 원수인 프레지던트는 대륙회의나 연합헌장하의 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던 의장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미니스터는 목사, 성직자, 장관, 대신, 공사 등을, 프라임은 ‘가장 중요한’ 또는 ‘최고’의 뜻이니 프라임 미니스터는 장관의 우두머리쯤으로 해석된다.
통령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쓰인 것은 중국 남송(南宋) 때로 통제(統制) 밑의 무관직으로 통령과 부통령이 있었다. 또 청말(淸末) 군제를 개혁하면서 총사령관인 총통(總統) 아래 전국에 26개진(鎭·사단급)을 두고 진마다 2개의 협(協·여단급)을 두었는데 진의 장을 통제, 협의 장을 통령 또는 협령이라고 했다.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가원수를 제국시대 중국의 군 계급, 특히 총통이나 통제, 대신 등의 아래로 차상급 이하의 지위인 통령에 대자를 붙여 부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생각해 봄 직하다.
역시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법원, 대검찰청, 대장
사법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대검찰청도 우리나라에서만 대자가 들어 있다. 일본과 중국, 타이완은 각각 최고재판소와 최고인민법원, 최고법원이라고 부른다. 북한은 중앙재판소라고 한다. 미국과 영국 등도 모두 최고재판소(the Supreme Court)라고 한다. 대검찰청도 중국과 일본은 최고인민검찰원, 최고검찰청이라고 한다. 타이완과 북한은 최고법원·검찰서, 중앙검찰소가 있다.
영어로 대검찰청은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인데 이 역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대검찰청으로 번역하지 않고 최고검찰원이나 최고검찰청으로 번역해 쓰고 있다. 군대 계급에서 최고는 대장이다. 대장이라는 명칭 역시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에만 있다. 중국은 소장, 중장, 상장, 대장이 있었으나 1988년 대장을 1급 상장으로 명칭을 바꿨다가 그나마 전시(戰時)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9년부터는 없애 장성급은 현재 소장, 중장, 상장으로 상장이 가장 높다. 중국은 미국의 대장(4성장군)을 ‘4성 상장’으로 번역, 대장 칭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위대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군대는 장성급을 장관(將官), 영관급을 좌관(佐官), 위관급을 위관(尉官)으로 부르며 장성은 장보(將補)와 장(將), 영관은 3좌·2좌·1좌, 위관은 3위·2위·1위로 구분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장성은 준장, 소장, 중장, 대장으로 되어 있으며 북한은 소장, 중장, 상장, 대장 순이다.
미국에서는 육군과 공군 장성을 제너럴(a general), 해군 장성을 어드미럴(an admiral)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만 원스타(a brigadier general)를 준장, 투스타(a major general)를 소장, 쓰리스타(a lieutenant general)를 중장, 포스타(a general)를 대장으로 번역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자를 많이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시아 동쪽 끝 반도에 살면서 이를 벗어나 대륙을 향해야 한다는 집념 때문일까? 아니면 항상 밀접한 교류를 가졌던 넓은 중국을 흠모해서일까?
우리 국민들은 인명이나 기관명 외에 직업에 대한 대자 지향성도 상당하다. 예를 들어 식당을 하다 성공하면 더 큰 식당을 차리고 큰 식당이 잘되면 이를 청산하고 사회적으로 더 그럴듯한 사업을 찾는 사람이 많다. 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더 큰 기업의 오너가 되기를 원하고 큰 기업이 되면 내실화보다는 확장을 통해 재벌이 되기를 원한다. 재벌이 돼서도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이나 일본같이 수십 년, 수백 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종목의 가게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는 장사를 아주 크게 하거나 쓸모 있는 것을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양반이나 관리 등 지배층에 비해 보잘것없다는 인식이 예부터 사회 저변에 흐르면서 좀 더 사회적으로 대접받기를 원하고 천대받는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잠재돼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진정한 大를 四海에 펼치자
큰 것을 꿈꾸고 이를 이루기 위해 나아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 시절과 6·25전쟁을 딛고 세계 10위 경제권에 진입한 기적을 이뤘는지도 모른다. 단지 경계해야 하는 것은 큰 것을 이루기만을 위해 계속 같은 속도나 형태로 나가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이 됐는데도 더 큰 재벌이 되기 위해 집착한다든지, 이미 명장이 된 장인이 더 나은 장인이 되기 위한 것에만 계속 시간을 쓴다면 그 꿈은 영원히 이뤄지기 힘들 것이다.
어느 정도 큰 것을 이룬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겠지만 대인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면서 작은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재벌 회사의 공장이 기존 제품 운송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운송업체를 만들어 운영한다든지, 구내식당 운영권을 빼앗아 자회사를 만들어 맡긴다든지, 빵가게 등 영세 업종까지 싹쓸이하려는 등의 행위 말이다.
《노자(老子)》 ‘도덕경’에 “큰 모서리는 모퉁이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며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모습은 형체가 없으며 도는 나타나지 않아 무엇이라 이름할 수 없다(大方無隅 大器晩成 大音希聲 大象無形 道隱無名)”는 말이 있다.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대’의 경지는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뜻과 통하는 것 같다.
‘대인’과 ‘대기관’이 많은 대한민국은 작은 것에 구애됨이 없이 큰 뜻을 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글로벌 세대에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우리의 입지를 더욱 넓혀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큰 포부를 갖고 열심히 매진하면서도 ‘작지만 진정한 대국’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변을 살피고 배려할 줄 아는 큰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참다운 대인이 대통령으로 뽑혀 국내외에 ‘대’를 펼치고 발전시켜 주길 기원해 본다.⊙
사실 ‘대’자는 부사, 명사, 동사로도 일부 쓰이나 주로 형용사로 쓰인다. 대인(大人), 대사건(大事件), 대홍수(大洪水), 대주주(大株主), 대왕(大王), 대기록(大記錄), 대참사(大慘事), 대공원(大公園), 대역사(大役事), 대의(大義) 등으로 말이다.
영어권에서도 ‘대’에 해당하는 ‘big’이나 ‘large’, ‘huge’, ‘great’를 주로 형용사로 쓴다. 빅세일(Big Sale), 빅뱅(Big Bang), 중요인물(a big man), 위인(a great man), 몸집이 큰 사람(a large man), 거인(a huge man), 대기업(a large company) 등등….
이들 단어가 고유명사를 구성하는 예는 오대호(Great Lakes)와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Great Victoria Desert) 등 일부 지명에 불과하고 인명이나 상호명, 기관명에는 거의 없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를 좋아하지만 인명에 대해서는 대자를 넣어 쓰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지 ‘대’ 대신 같은 의미인 ‘태(泰)’를 더 많이 쓴다. 요즈음에는 아름이, 보람이, 한별이, 초롱이, 하나, 한나 등 한글 이름도 많지만 1990년 이전 주로 한자 이름을 쓰던 세대 출생자들에게는 ‘대’와 ‘태’자가 많다. 필자 주변 지인만으로도 대희, 대성, 대수, 대진, 대호, 대업, 성대, 승대와 성태, 영태, 주태, 태수, 태권, 태영, 태주 등 수두룩하다.
우리가 대나 태를 좋아하는 정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쉬운 방법으로 동북아 한자권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다.(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이름에 대자가 있는 의원은 경대수(慶大秀·이하 경칭생략) 등 6명이고 태자를 쓴 의원은 김성태(金聖泰) 등 9명이다.
중국은 177명의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 가운데 대와 태자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고, 중화민국(타이완)도 국회의원(입법위원) 113명 가운데 2명이 있다. 일본은 중의원 479명 가운데 9명,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가운데 17명이 있다. 나라별 점유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5.0%로 중국 1.1%, 타이완 1.8%, 일본 1.9%, 북한 2.5%에 비해 배 이상이다.
성서 인물 이름이 인기인 구미
구미의 경우 구조적으로 ‘대’에 해당하는 big, large, huge, great 등을 넣어 이름을 짓기 곤란하다. 좋다거나 훌륭하다는 뜻인 good, fine, nice 등 어떤 목적이나 의미가 있는 형용사들도 넣어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구미인들은 유명한 왕이나 신화 속 인물, 조상(祖上), 성서에 나오는 인물 등에서 차용해 이름을 짓는 사람이 많다.
영국이나 미국 등 영어권에서 많이 쓰는 15대 이름은 존(John), 데이비드(David), 제임스(James), 스티븐(Stephen, Steven), 윌리엄(William), 로버트(Robert), 조지(George), 피터(peter), 마이클(Michael), 토머스(Thomas), 폴(Paul), 필립(Philip), 애덤(Adam), 리처드(Richard), 요셉(Joseph), 찰스(Charles), 에드워드(Edward) 등이다.
현 미국 하원 435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쓰고 있는 이름은 존(20명), 제임스(15명), 스티븐(14명), 데이비드(10명), 윌리엄(10명)이며 영국 하원(649명) 가운데에는 데이비드(33명), 존(23명), 스티븐(21명), 제임스(19명), 폴(11명) 등이다. 이들 이름은 영어권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등의 언어권에서도 두루 쓰인다.
예를 들어 존은 프랑스어로 장(Jean), 네덜란드어로 얀(Jan), 독일어로 요한(Johann), 러시아어로 이반(Ivan), 스페인어로 후안(Juan), 포르투갈어로 주앙(Joao)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피터는 프랑스어로 피에르(Pierre), 러시아어로 표트르(Pyotr, Pe tr), 스페인어로 페드로(Pedro), 이탈리아어로 피에트로(Pietro), 포르투갈어로 페드루(Pedro) 등으로 불린다. 이들 15대 이름들의 유래를 따져보면 로버트와 윌리엄, 리처드, 찰스, 에드워드 등 5개 이름은 유명한 왕들의 이름이었고 나머지 10개 이름은 성서에 나오거나 기독교와 관계된 인물들의 이름이었다.
중세(927~1087년) 노르망디 공작의 경우 윌리엄 1세, 리처드 1세, 리처드 2세, 리처드 3세, 로버트 1세, 윌리엄 2세 순으로 이어졌다. 찰스와 에드워드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이자 프랑크의 왕인 찰스 1세(742~814)와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1003~1066) 등이 있다.
성서에서 빌려온 인명인 존의 경우 요한(John)의 영어식 이름으로 예수에게 세례를 준 선지자 ‘세례 요한’과 예수의 제자로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쓴 것으로 알려진 ‘사도 요한’이 유명하다. 성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지만 후대에는 거의 쓰지 않는 이름이 있다. 유다(Judas)다. 예수의 제자였으나 예수를 팔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자이다.
성서에는 그를 가롯유다(Judas Iscariot)로 기록했는데 예수의 12제자 중에는 가롯 유다 말고도 ‘유다 도마’, ‘유다 다대오’ 등이 있었으며 예수의 막내동생(넷째) 이름 역시 유다였다. 그러나 흔했던 유다라는 이름은 가롯 유다로 인해서인지 그 뒤 쓰는 사람이 극히 적다. ‘이스가리옷(Iscariot)’은 이후 배반자 또는 모반자라는 명사로도 쓰이고 있다.
몸 낮춘 고대 제후들의 자칭어(自稱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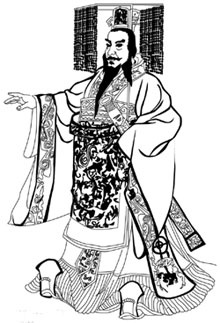 |
| 제왕이 자칭하는 말로 ‘짐(朕)’이라는 표현을 처음 쓰기 시작한 진시황. |
자신을 낮춘 것은 왕이나 제후들도 마찬가지였다. 예부터 임금들은 자신을 여(余, 予), 고(孤), 과인(寡人), 불곡(不穀), 짐(朕) 등으로 불렀다. 이들 명칭은 모두 중국 춘추전국시대(기원전 770~221)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나 과인은 왕이나 군주들 또는 일부 사대부들이 두루 사용했으며 ‘저’와 비슷한 겸양어였다.
처음부터 일반인이 아닌 왕이나 제후들이 자신을 부르는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 고와 불곡이다. 고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신하나 백성들은 몰려다니는 데 반해 제왕은 일반인이 감히 주변에 가까이 오지 못해 마치 혼자 외롭게 있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라는 풀이다. 불곡은 ‘좋은 사람이 못된다’는 겸양어다. 곡(穀)은 곡식 외에 선(善)이라는 뜻이 있으며 선 역시 ‘착하다’는 뜻 외에 ‘호인(好人)’이나 ‘길(吉)하다’는 뜻도 있어 불곡은 ‘착하거나 길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짐은 진시황(秦始皇)이 처음 사용한 뒤 역대 황제나 제왕들이 사용하는 자칭어로 정착됐다. 그러나 짐은 진시황이 쓰기 이전부터 일반에 이미 널리 쓰이던 명칭이었다. 일반 평민이나 노예까지 두루 쓰던 말로 ‘나’를 뜻했다.
상호(商號)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대를 많이 쓴다. 우리나라 2011년 매출액 순위 100대 기업 가운데 대자가 들어간 기업은 대우인터내셔널 등 7개, 도급순위 100위 건설업체 가운데는 대림건설 등 10개나 된다. 중국 100대 기업과 일본과 타이완의 상장 매출순위 100대 기업 가운데 대자가 들어간 기업은 각각 3개씩이다. 역시 우리나라 기업이 이들 나라보다 2배 이상 많다. 영어권은 인명과 마찬가지로 상호에 ‘big’ 등 ‘대’와 같은 의미의 문자는 쓰지 않는다.
중국자전(中國字典)에 “‘대’는 갑골문에 나오는 오래된 자로 소(小)의 반대말이며 ‘사지를 쭉 편 인형(四肢伸展的人形)’이나 ‘엄숙하고 단정하게 앉아 있는 통치자(危襟正坐的統治者) 형상’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옛날에 크다는 것을 두 손과 두 발을 한껏 벌려 표현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위엄 있는 통치자가 앉아 있는 것도 크게 느꼈을 것이다.
대는 크다는 것 외에 경지가 넓고(廣) 정도가 깊고(深) 성질이 중요(重要)하다는 뜻도 있다. 대와 같은 뜻의 한자어로 앞서 말한 태(泰)와 함께 태(太), 호(昊), 거(巨), 위(偉), 환(桓)이 있다.
진시황이 당시 일반 제후나 왕이 사용하던 ‘저’를 뜻하는 ‘여’나 ‘과인’에서 ‘나’란 뜻인 ‘짐’으로 바꿨다는 것은 자신을 다른 왕들에 비해 한 단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더 높이기 위한 명칭을 따로 만들지 않은 점으로 미뤄 당시 황제일지라도 스스로 높이는 명칭을 쓰기는 어려울 만큼 유교적 사상이 강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짐은 이후 일반에는 쓰이지 않은 반면 과인 등은 제후나 왕의 자칭어로 계속 쓰였는데 조선조의 왕들도 상국(上國)인 중국 황제가 쓰는 ‘짐’을 쓸 수 없다고 해 역시 자신을 ‘과인’으로 칭했다. |
 |
| 칭기즈칸 등이 사용했던 ‘칸’이라는 호칭은 동북아 유목민족이 널리 사용했던 군주의 호칭이었다. |
영국의 경우 그레이트 브리튼(Great Britain)이라고 그레이트(great)가 들어가지만 이는 잉글랜드(England), 웨일스(Wales), 스코틀랜드(Scotland)를 망라한 영국의 본토 ‘그레이트 브리튼 섬’을 뜻한다. 영국의 공식명칭은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다.
이와 관련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는 대영박물관(大英博物館·The British Museum)도 그냥 영국박물관(英國博物館)이나 국립 영국박물관으로 고쳐 번역해야 맞을 것 같다.
대한이라는 국호가 처음 등장한 것은 조선조 말인 1897년이다. 조선 왕이던 고종이 원구단을 만들어 황제 즉위식을 갖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꿨다. 나라 이름에 ‘대’를 넣고 황제를 자칭한 것이다. 당시 국호는 고종과 대신들의 논의에서 확정되었는데 ‘대한’으로 정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 등 삼한을 아우른 것이니 큰 한(韓), 곧 대한이라는 이름이 적합하고, 조선은 옛날 기자(箕子)가 봉(封)해졌을 때의 이름이니 당당한 제국의 명칭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대한’의 한은 크다 또는 영수(領袖), 왕 등을 뜻하는 한(汗)과 같은 음이다. 신채호(申采浩) 등 일부 학자들은 한(韓)은 한(汗)과 같은 뜻이고 신라시대 왕의 칭호인 거서간(居西干)과 마립간(麻立干)의 간(干)도 같은 뜻으로 해석했다. 중국자전에 따르면 한(汗) 또는 가한(可汗)은 고대 선비(鮮卑), 유연(柔然), 돌궐(突厥), 회흘(回紇), 몽고(蒙古)족 등의 족장이나 통치자(왕)의 명칭이며 대한(大汗)은 황제 또는 제왕을 뜻한다.
예를 들어 원 제국을 세운 몽고의 테무친(鐵木眞)은 제호(帝號)가 칭기즈 칸으로 한자 표기로는 청지스한(成吉思汗)인데 이는 몽고제국(蒙古帝國)의 대한(大汗)이자 ‘전 세계의 군주’라는 뜻이다.
이 같은 명칭은 중국 최후의 왕조인 청나라까지 이어져 황제들의 명칭을 ‘한’이나 ‘칸’으로 썼다. 옹정제(雍正帝)의 경우 만주어로는 후왈리야순 톱 한(Huwaliyasun Tob Han), 몽골어로는 나이랄트 퇴브 칸(Nairalt Tov Khaan)이라 불렸다. 한(汗)과 한(韓)이 같이 쓰였다는 것은 중국 역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북위(北魏) 효문제(孝文帝) 때 선비족(鮮卑族) ‘추다한(出大汗)’이 ‘한(韓)’과 ‘한(汗)’이 같은 음이라는 이유로 성씨를 한(韓)으로 했으며 명(明) 때 간쑤성(甘肅省) 린샤(臨夏)의 ‘거한(可汗)’도 ‘한(韓)’을 성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일부 학자들은 ‘대한’은 크다는 뜻의 ‘한(韓)’에 대(大)가 중복된 명칭으로 풀이한다. 대한을 ‘더할 나위 없이 크고 큰 나라(大大)’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다.
無邊廣大한 우주를 품은 태극기
 |
이 기는 제물포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게양됐다. 이 국기의 형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확한 기록이 없어 ‘괘가 없는 태극기’나 ‘팔괘 태극기’로 추정돼 왔으나 이 조약 체결 2개월 뒤인 7월 19일 미국 해군부가 제작한 도서 《해양 국가들의 기》에 태극기가 실려 있는 것이 2008년 밝혀져 이 기가 이응준이 제작한 것으로 학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 기는 4괘의 위치와 태극 문양이 약간 다르지만 현재의 태극기와 전체적인 모습이 흡사하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흰색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나타낸다. 태극 문양의 파랑과 빨강은 음(陰)과 양(陽)의 조화를, 4괘는 음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태극기의 원형은 태극의 철학 사상을 원리로 하는 ‘태극 8괘’를 기초로 한 것이다.
중국 《역경(易經)》의 ‘계사전(繫辭傳)’에서는 태극을 음·양의 근원이자 통일체로 보고 태극에서 양의(兩義), 4상(四象), 8괘(八卦)가 차례로 생겼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태극에서 음양(兩儀)이 생기고 음양이 춘하추동(四象)으로 발전하고 춘하추동이 하늘과 땅 등 모든 우주 만물(八卦)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8괘는 음(--)과 양(—)의 결합·교감함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건(乾)·곤(坤)·진(震)·손(巽)·감(坎)·이(離)·간(艮)·태(兌)로 표시하며 각각 하늘(天)·땅(地)·우레(雷)·바람(風)·물(水)·불(火)·산(山)·연못(澤)의 8가지 자연현상을 뜻한다.
우리 태극기는 태극 8괘 그림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45도 이동시켜 8괘 가운데 4괘만 표시하고 태극 문양의 회전 방향도 반대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태극기 문양에 대해 상당기간 구설수가 뒤따랐었다. 광복 후 국토가 남북으로 갈린 것에 대해 “좌우 대칭인 태극의 문양을 상하 대칭으로 바꿔 그린 태극기 때문에 남북 분단이 발생했다”는 말이 일부 호사가들에 의해 항간에 나돌았다. 또 “태극을 위는 붉은색, 아래는 파란색으로 그리면서 붉은색이 45도 서쪽(왼쪽)으로 기울어지게 해 붉은색(북)이 파란색(남)을 침범하게 돼 있다”며 “북의 침략으로 6·25전쟁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도 있었다. 이와 함께 “전쟁으로 인해 남북의 경계가 태극 모양으로 변하게 됐다”는 말도 함께 퍼졌다. 이는 직선이던 38선이 휴전 뒤 동쪽은 북으로 올라간 반면, 서쪽은 남으로 처진 휴전선으로 대체되자 더욱 그럴듯하게 퍼져 나갔다.
세계 각국의 국기는 삼색기(三色旗)가 주류를 이룬다. 삼색기는 3가지 색만으로 3등분된 기를 말한다. 유럽에서는 46개국 가운데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등 22개국의 국기가 삼색기다. 세계적으로는 68개국이 삼색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삼색기는 주로 푸른색, 흰색, 빨간색, 녹색으로 구성됐으나 나라마다 의미는 각각 다르다.
네덜란드 국기는 빨강은 용기를, 흰색은 신앙을, 파랑은 충성을 상징하지만 러시아 국기는 흰색은 고귀함과 진실·고상함·솔직·자유·독립을, 파랑은 정직·헌신·순수·충성을, 빨강은 용기·사랑·자기희생을 나타낸다. 다른 나라 국기들도 모양은 다르지만 대부분 자유나 평등, 평화, 사랑, 정직, 혁명, 신앙, 태양, 십자가 등 단순한 뜻을 상징하는 색깔이나 무늬로 구성돼 있다. 크고 넓은 우주의 생성·변환 원리를 담은 태극 8괘를 근간으로 만든 태극기는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태(泰)는 《역경》에서도 대(大)를 의미하는데 태괘(泰卦)는 ‘작은 것은 나가고 큰 것이 들어와 길(吉)하고 형통(亨通)하다’는 뜻이다.
태(泰)는 《역경》에서도 대(大)를 의미하는데 태괘(泰卦)는 ‘작은 것은 나가고 큰 것이 들어와 길(吉)하고 형통(亨通)하다’는 뜻이다.태(太)는 태평양(太平洋), 태양(太陽), 태초(太初), 태고(太古), 태공(太公·조부 또는 증조부) 등과 같이 대자와 같은 뜻이지만 보다 더 원초적이고 철학적인 데 많이 쓰인다. 호(昊)는 대 또는 하늘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하늘의 이름은 계절별로 달리 부르는데 봄의 하늘은 창천(蒼天), 여름은 호천(昊天 또는 昊穹), 가을은 민천(旻天), 겨울은 상천(上天)이라고 한다. 거는 거대(巨大), 거부(巨富), 거목(巨木), 거수(巨樹) 등으로 주로 어떤 물질이 크다는 것에 많이 쓴다. 형이상학적으로 크다는 데 쓰는 태(太)와 대비된다. 위(偉)는 위인(偉人), 위업(偉業) 등 크다는 뜻과 함께 ‘웅장하고 아름답다(壯美)’, ‘특출하다(奇特)’는 뜻을 함께 갖고 있다. 환(桓)은 굳세다는 뜻이지만 원래 뜻은 명사로 고대 역참(驛站)이나 관청 옆에 이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기둥인 표주(表柱 또는 標柱)를 말하며 형용사로 쓸 때는 크다(大)는 뜻이다. 대(大), 태(泰) 외에 태(太), 호(昊), 거(巨), 위(偉), 환(桓) 등을 합하면 크다는 뜻의 인명은 훨씬 많아질 것이다. |
영원을 꿈꾸지만 진취성 부족한 애국가
 |
| 1882년 10월 일본 외교관 요시다의 문서에 있는 태극기. 1882년 9월 수신사 박영효가 태극기를 제정했을 당시의 모습으로 추정되며, 앞서 나온 이응준 태극기에서 좌우 괘의 위치만 바뀌었다. |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은 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한대(無限大)다. 그러나 가사의 내용을 보면 큰 뜻을 이루겠다는 진취적인 기상이나 국력이 사해에 떨치게 해달라는 능동적인 기원은 없다. 속된 말로 “인생을 짧고 굵게 살 것이냐” 아니면 “가늘고 길게 살 것이냐”는 물음에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는 대답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나라의 노래인 만큼 “굵고 길게 살고 싶다”는 내용이 담기길 바라는 것이 욕심일까?
다른 나라 국가를 보자.
중국의 국가는 ‘의용군 진행곡’으로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여! 우리의 피와 살로 새로운 만리장성을 세우자!…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적군의 포화를 용감히 뚫고, 전진하자! 전진하자! 나가자!”이다.
타이완의 국가는 ‘삼민주의(三民主義)’로 “삼민주의는 우리의 근본… 아 그대들이여, 민족을 위해 선봉에 서라… 한마음 한뜻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뜻을 이루자”는 내용이다.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君が代)’의 가사는 “임(君·일본 천황)의 치세는 천 대에 팔천 대에 작은 조약돌이 큰 바위가 되어 이끼가 낄 때까지”다.
영국의 국가는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God Save the Queen)’로 “신이여 자비로운 우리 여왕을 구하소서… 여왕의 적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패망하게 하소서. 그들의 책략을 깨뜨리시고 악랄한 흉계를 헛되게 하소서…”로 되어 있다.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는 “가자 조국의 아들들아 영광의 날이 왔다!… 무장하라, 시민들이여 무리를 지어라. 행진하자, 행진하자! 불순한 피가 우리의 밭을 적실 때까지!”다.
미국 국가 ‘성조기여 영원하라’는 “… 우리를 감싸는 성조기는 치열한 전투 중 우리가 사수한 성벽 위에서도 의연히 나부끼고 있었다. 붉게 타오르며 작렬하는 포화와 치열한 폭탄 속에서도 우뚝 서 있음을 우리는 보았다…”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모두 전쟁과 피비린내가 난다. 자유, 독립이나 적에 대한 승리 등을 위한 결연한 의지도 담고 있다.
단지 일본의 국가가 왕의 치세가 오래가길 염원하는 내용이어서 일견 우리 애국가의 ‘영원무궁토록 보존해 달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영원에 대한 표현이 우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고 일본은 ‘조약돌이 큰 바위가 되기까지’로 다르다. 우리는 신에 현상 그대로의 보존을 바라는 것이라면 일본은 무언가 조성되어 변화되는 가운데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바라는 뜻이어서 다르다.
매일 지고 피는 無窮한 꽃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無窮花)는 어떤가?
무궁은 끝이 없는 크고 광대무변(廣大無邊)하다는 뜻이다. 역시 대자가 연상되는 이름이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지만 다음 날에는 다른 가지에서 또 꽃을 피우는 무궁화는 7월부터 10월까지 100여 일을 매일 피고 지는 생명력이 강한 꽃이다. 무궁화는 중국어 목근화(木槿花)의 발음 ‘무진화’에 대한 취음(取音) 표기로 보는 사람이 많다. ‘무궁화’로 불린 것은 조선시대 이후로, 그 이전에는 각종 기록에 ‘목근(木槿)’ 또는 ‘근화(槿花)’, ‘순(舜)’ 등으로 불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와 무궁화의 인연은 오래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기원전 3세기 이전에 저술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고서(古書) 《산해경(山海經)》의 ‘해외동경(海外東經)’ 편에 “군자의 나라에 훈화초가 있는데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君子之國有薰華草朝生夕死)”고 되어 있다. 군자의 나라는 옛 고조선이나 삼한을, 훈화(薰華)는 순화(舜華)와 함께 무궁화의 옛 이름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서 목근화나 순화 등으로 부르는 꽃을 우리는 무궁화라고 부르는 것은 무궁이라는 글자를 선호한 국민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무궁 역시 대(大)와 통하기 때문이다.
대자로 시작하는 국가기관… 대통령
 |
| 일본 최고재판소. 한자문화권에서 사법기관에 ‘대(大)’라는 말을 사용하는 곳은 한국뿐이다. |
일반적으로 영어권은 대통령 중심제의 경우 프레지던트(President), 내각책임제의 경우 프라임 미니스터(Prime minister)이다. 프레지던트는 국가원수에게만 쓰이는 말이 아니다. 회사의 사장이나 부장, 대학 총·학장, 회의장의 의장, 사회자 등에게 보편적으로 붙인 명칭이며 미국의 국가 원수인 프레지던트는 대륙회의나 연합헌장하의 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던 의장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미니스터는 목사, 성직자, 장관, 대신, 공사 등을, 프라임은 ‘가장 중요한’ 또는 ‘최고’의 뜻이니 프라임 미니스터는 장관의 우두머리쯤으로 해석된다.
통령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쓰인 것은 중국 남송(南宋) 때로 통제(統制) 밑의 무관직으로 통령과 부통령이 있었다. 또 청말(淸末) 군제를 개혁하면서 총사령관인 총통(總統) 아래 전국에 26개진(鎭·사단급)을 두고 진마다 2개의 협(協·여단급)을 두었는데 진의 장을 통제, 협의 장을 통령 또는 협령이라고 했다.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가원수를 제국시대 중국의 군 계급, 특히 총통이나 통제, 대신 등의 아래로 차상급 이하의 지위인 통령에 대자를 붙여 부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생각해 봄 직하다.
역시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법원, 대검찰청, 대장
사법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대검찰청도 우리나라에서만 대자가 들어 있다. 일본과 중국, 타이완은 각각 최고재판소와 최고인민법원, 최고법원이라고 부른다. 북한은 중앙재판소라고 한다. 미국과 영국 등도 모두 최고재판소(the Supreme Court)라고 한다. 대검찰청도 중국과 일본은 최고인민검찰원, 최고검찰청이라고 한다. 타이완과 북한은 최고법원·검찰서, 중앙검찰소가 있다.
영어로 대검찰청은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인데 이 역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대검찰청으로 번역하지 않고 최고검찰원이나 최고검찰청으로 번역해 쓰고 있다. 군대 계급에서 최고는 대장이다. 대장이라는 명칭 역시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에만 있다. 중국은 소장, 중장, 상장, 대장이 있었으나 1988년 대장을 1급 상장으로 명칭을 바꿨다가 그나마 전시(戰時)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9년부터는 없애 장성급은 현재 소장, 중장, 상장으로 상장이 가장 높다. 중국은 미국의 대장(4성장군)을 ‘4성 상장’으로 번역, 대장 칭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위대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군대는 장성급을 장관(將官), 영관급을 좌관(佐官), 위관급을 위관(尉官)으로 부르며 장성은 장보(將補)와 장(將), 영관은 3좌·2좌·1좌, 위관은 3위·2위·1위로 구분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장성은 준장, 소장, 중장, 대장으로 되어 있으며 북한은 소장, 중장, 상장, 대장 순이다.
미국에서는 육군과 공군 장성을 제너럴(a general), 해군 장성을 어드미럴(an admiral)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만 원스타(a brigadier general)를 준장, 투스타(a major general)를 소장, 쓰리스타(a lieutenant general)를 중장, 포스타(a general)를 대장으로 번역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자를 많이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시아 동쪽 끝 반도에 살면서 이를 벗어나 대륙을 향해야 한다는 집념 때문일까? 아니면 항상 밀접한 교류를 가졌던 넓은 중국을 흠모해서일까?
우리 국민들은 인명이나 기관명 외에 직업에 대한 대자 지향성도 상당하다. 예를 들어 식당을 하다 성공하면 더 큰 식당을 차리고 큰 식당이 잘되면 이를 청산하고 사회적으로 더 그럴듯한 사업을 찾는 사람이 많다. 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더 큰 기업의 오너가 되기를 원하고 큰 기업이 되면 내실화보다는 확장을 통해 재벌이 되기를 원한다. 재벌이 돼서도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이나 일본같이 수십 년, 수백 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종목의 가게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는 장사를 아주 크게 하거나 쓸모 있는 것을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양반이나 관리 등 지배층에 비해 보잘것없다는 인식이 예부터 사회 저변에 흐르면서 좀 더 사회적으로 대접받기를 원하고 천대받는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잠재돼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진정한 大를 四海에 펼치자
큰 것을 꿈꾸고 이를 이루기 위해 나아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 시절과 6·25전쟁을 딛고 세계 10위 경제권에 진입한 기적을 이뤘는지도 모른다. 단지 경계해야 하는 것은 큰 것을 이루기만을 위해 계속 같은 속도나 형태로 나가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이 됐는데도 더 큰 재벌이 되기 위해 집착한다든지, 이미 명장이 된 장인이 더 나은 장인이 되기 위한 것에만 계속 시간을 쓴다면 그 꿈은 영원히 이뤄지기 힘들 것이다.
어느 정도 큰 것을 이룬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겠지만 대인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면서 작은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재벌 회사의 공장이 기존 제품 운송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운송업체를 만들어 운영한다든지, 구내식당 운영권을 빼앗아 자회사를 만들어 맡긴다든지, 빵가게 등 영세 업종까지 싹쓸이하려는 등의 행위 말이다.
《노자(老子)》 ‘도덕경’에 “큰 모서리는 모퉁이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며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모습은 형체가 없으며 도는 나타나지 않아 무엇이라 이름할 수 없다(大方無隅 大器晩成 大音希聲 大象無形 道隱無名)”는 말이 있다.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대’의 경지는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뜻과 통하는 것 같다.
‘대인’과 ‘대기관’이 많은 대한민국은 작은 것에 구애됨이 없이 큰 뜻을 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글로벌 세대에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우리의 입지를 더욱 넓혀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큰 포부를 갖고 열심히 매진하면서도 ‘작지만 진정한 대국’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변을 살피고 배려할 줄 아는 큰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참다운 대인이 대통령으로 뽑혀 국내외에 ‘대’를 펼치고 발전시켜 주길 기원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