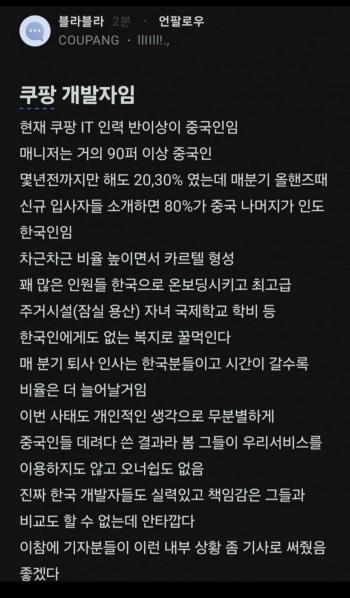- 수원 화성에서 가장 조형미가 빼어난 곳이 왼쪽의 방화수류정과 오른쪽의 화홍문이다.
정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왕조(王朝)는 석양(夕陽)과 같았다. 정조는 한양이 싫었다. 아버지 사도세자와 할아버지 영조와 음모를 일삼는 신하로 가득한 복마전을 떠나고 싶었다. 1789년 경기도 양주 배봉산에 있던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 융건릉으로 옮긴 것은 왕이 꿈꾸던 역사(役事)의 첫걸음이었다.
정조는 1796년 10월 화성(華城)을 완공했다. 당초 10년이 걸릴 것이라던 예측을 뒤엎고 34개월 만에 낙성연을 치렀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에는 정조의 야심이 담겨 있다. 그것은 왕조의 부흥(復興), 부국강병이라는 조선의 마지막 르네상스가 그의 목표였다.
실학의 선구자 반계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팔달산 아래의 신읍(지금의 수원시)은 구읍(화성시)보다 지형상 규모가 크며 낮고 평평한 구릉만 있을 뿐 대부분 평야지대로 이곳에 축성해 읍치로 삼는다면 실로 대도회지로 발전할 수 있다.” 실학자답게 그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즉 1만 호를 수용할 적지(適地)라고 한 것인데 실제 수원은 지형상 서울과 삼남(충청·경상·전라도)에 가까운 요충지였다. 훗날 이 글을 본 정조는 “반계야말로 오늘의 국사와 현실에 유용한 경국제세(經國濟世)의 대학자”라고 격찬했다고 한다. 정조는 화성을 건설하며 한양의 방비도 생각했다.
즉 한양을 중심으로 북쪽의 북한산성과 개성 대흥산성, 서쪽 강화도성과 문수산성, 동쪽 남한산성에 남쪽의 수원 화성을 더하면 한양의 외곽방비 체제가 완벽하게 확립된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정조는 중국 한당(漢唐) 시대의 수도 장안(長安)을 모델로 삼았으며 몇몇 건물의 이름도 차용했다.
안문, 신풍루, 장락당 등이 그것이다. 수원 화성이 당초 예상을 뒤엎고 초단기간에 완성됐는데 거기엔 이유가 있다. 흙으로 쌓을 경우 인력이 많이 들어 석축(石築)을 하려 했는데 성을 쌓기 한 달 전 팔달산 서쪽의 숙지산(熟知山·영복여고 뒷산)과 여기산(麗岐山)에서 석맥이 발견된 것이다.
여기에 당대의 천재 다산 정약용이 왕명을 받아 만든 거중기를 사용하면서 공기(工期)를 앞당겼다.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정조는 화성이 완공된 후인 1800년 6월 14일 급사한다. 새 세상을 만들자는 꿈이 건강 때문에 무산된 것인데 따지고 보면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정조의 사후(死後) 조선은 어린 순조가 외척들의 세도정치에 휘둘리면서 세계사에서 뒤처지게 됐고 정조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76년 만에 일본과 강화도 수호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한다. 그리고 다시 34년 만에 일본에 병합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역사다.⊙
정조는 1796년 10월 화성(華城)을 완공했다. 당초 10년이 걸릴 것이라던 예측을 뒤엎고 34개월 만에 낙성연을 치렀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에는 정조의 야심이 담겨 있다. 그것은 왕조의 부흥(復興), 부국강병이라는 조선의 마지막 르네상스가 그의 목표였다.
 |
| 정조는 수원 화성에 왕조의 부흥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
즉 1만 호를 수용할 적지(適地)라고 한 것인데 실제 수원은 지형상 서울과 삼남(충청·경상·전라도)에 가까운 요충지였다. 훗날 이 글을 본 정조는 “반계야말로 오늘의 국사와 현실에 유용한 경국제세(經國濟世)의 대학자”라고 격찬했다고 한다. 정조는 화성을 건설하며 한양의 방비도 생각했다.
 |
| 북쪽으로 한양을 바라보는 문이 장안문이다. |
 |
| 수원 화성행궁 앞에서 보면 세 개의 현판이 겹쳐 보인다. 위에서부터 좌익문, 중양문, 봉수당이다. |
 |
| 화성 안에는 군사들을 조련할 수 있는 연무대가 있다. |
 |
| 가을날의 화성. |
 |
|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팔달문. 이 문은 수원성의 남쪽문으로 이름은 서쪽에 있는 팔달산에서 따 왔다. |
 |
| 화성 곳곳에 설치된 돈대는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