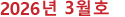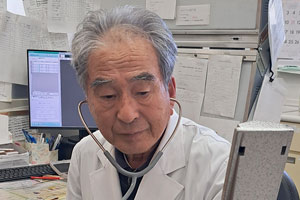- 쓰나미가 들이닥친 나토리(名取)의 한 마을 모습이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경상남도 경주에서 9월 12일 진도 5.8의 강진(强震)이 발생한 이후 여진(餘震)이 계속되고 있다. ‘경주 강진’ 이후 한국 사회는 지진 초보국임을 드러냈다. 일본이 지진을 ‘동반자’처럼 여겨 철저히 준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 다른 강진이 올 경우 한국은 지진이 아니라 공포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기자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규모 9.0의 지진과 이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 그리고 이어진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를 취재한 바 있다.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진이 발생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를 사진과 함께 알아보기로 한다.
기자는 금요일이었던 사건 당일 오후 3시쯤 조선일보 본사로부터 일본 현장 취재 명령을 받았다. 초고속으로 발권 작업을 마쳐 오후 6시 인천공항에서 일본행 항공기를 탈 수 있었다. 당시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편은 인천~나리타(成田), 인천~하네다(羽田), 인천~니가타(新潟) 세 편이 있었다.
지진 발생 지역이 우리 동해안 강릉 쯤에 해당하는 센다이(仙臺)였기에 당연히 인천~나리타 혹은 인천~하네다 행 비행기에 올라야 했는데 당시 대한항공 홍보담당 상무의 조언이 결정적이었다. “지진이 나면 나리타나 하네다공항은 폐쇄될 수 있으니 정 일본에 가려면 니가타로 가라!” 그의 조언은 적중했다.
니가타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8시였다. 니가타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雪國)》의 무대다. 우리나라 같으면 초여름일 5월까지도 폭설이 내리는 곳이다. 기자가 도착한 날도 폭설이 내리고 있었지만 갈 곳이 없었다. 당연히 센다이로 가야 했고 설령 니가타에 묵더라도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수중에는 급히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카드대출한 100만원을 엔화로 바꾼 7만7000엔 정도가 있었다. 이 돈을 가지고 ‘무조건’ 센다이로 가야 했다. 마음씨 좋아 보이는 택시운전사와 흥정 끝에 4만 엔에 센다이까지 가기로 했다. 일본에서 택시를 타는 것은 워낙 비싸 금물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면 대중교통이 마비된다. 사진처럼 국철·지하철·버스·공항이 동시에 스톱되는 것이다. 센다이까지 가는 고속도로에서도 지진의 파괴력을 볼 수 있었다. 센다이에서 니가타는 꽤 먼 거리임에도 고속도로 곳곳에 금이 가 운전기사는 고속도로~국도~고속도로로 곡예운전을 하고 있었다.
새벽 4시 무렵, 운전기사는 “도저히 더는 못 가겠다”며 후쿠시마 JR역 앞 어느 호텔 입구에 기자를 내려놓고 줄행랑을 쳤다. 호텔 로비에는 이미 이재민들이 즐비했다. 집을 빠져나온 이들은 호텔 측에서 준 이불을 반으로 포개 뒤집어쓴 채 자고 있었다. 일본 이불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것보다 사이즈가 크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뉴스의 초점은 원래 목표였던 센다이가 아닌 후쿠시마였다. 원전에서 방사능이 대량 누출된 것이다. 이런 사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 대중교통이 완전 마비된다.
둘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먹을 것이 부족해져 마트나 편의점이 순식간이 동난다. 후진국의 경우 당연히 약탈이 일어나겠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
셋째, 식수도 구하기 힘들어진다.
넷째, 음식점을 비롯해 생활필수품 공급 상점이 일제히 문을 닫는다. 이것은 그 상점 역시 붕괴되기에 당연한 소리다.
다섯째, 가스누출 사고 위험 때문에 전기·가스 공급이 끊어져 가정에서 취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여섯째, 휘발유나 디젤처럼 차량용 에너지 공급이 한정된다. 일본의 경우 1인당 10L만 허용됐다.
일곱째, 여진이나 제2의 쓰나미 때문에 행동반경이 위축된다.
여덟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조·구호 활동이 늦어질 경우 연로자나 어린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
아홉째, 붕괴 위험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집에서 잘 수 없어 노숙(露宿)을 할 수밖에 없다.
열째, 은행이나 현금자동인출기 등이 멈춰 현금이 없을 경우 속수무책이 된다.
열한번째, 언론인들조차 생명에 위협을 느껴 취재를 마다하게 된다. 실제로 당시 현장에 있던 한국 기자들이 그랬다. 그렇다면 뉴스가 끊어져 더욱 공포감이 조장된다.
만일 여기까지라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복구 노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정상생활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일본처럼 지진·쓰나미에 이어 원전 사고 같은 ‘3종 세트’가 벌어진다면 수습 불능이 된다. 기자가 센다이에서 가장 불편했던 것은 굶는 것도, 자는 곳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다. 공중화장실마다 온통 인분(人糞)으로 넘쳤다는 사실이다. 파괴된 문명은 야만(野蠻)보다 훨씬 더 공포스럽다는 것을 일본의 대지진은 가르쳐줬다.⊙
기자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규모 9.0의 지진과 이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 그리고 이어진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를 취재한 바 있다.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진이 발생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를 사진과 함께 알아보기로 한다.
 |
| 초토화된 마을을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고 있다. |
지진 발생 지역이 우리 동해안 강릉 쯤에 해당하는 센다이(仙臺)였기에 당연히 인천~나리타 혹은 인천~하네다 행 비행기에 올라야 했는데 당시 대한항공 홍보담당 상무의 조언이 결정적이었다. “지진이 나면 나리타나 하네다공항은 폐쇄될 수 있으니 정 일본에 가려면 니가타로 가라!” 그의 조언은 적중했다.
 |
| 쓰나미 후 생필품 공급이 끊기자 주유소들은 차 한 대당 주유량을 10L로 제한했다. 휘발유를 넣기 위해 자동차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
당시 수중에는 급히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카드대출한 100만원을 엔화로 바꾼 7만7000엔 정도가 있었다. 이 돈을 가지고 ‘무조건’ 센다이로 가야 했다. 마음씨 좋아 보이는 택시운전사와 흥정 끝에 4만 엔에 센다이까지 가기로 했다. 일본에서 택시를 타는 것은 워낙 비싸 금물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
 |
| 차 두 대가 거꾸로 처박혀 있다. 자연의 힘은 이렇게 무섭다. |
새벽 4시 무렵, 운전기사는 “도저히 더는 못 가겠다”며 후쿠시마 JR역 앞 어느 호텔 입구에 기자를 내려놓고 줄행랑을 쳤다. 호텔 로비에는 이미 이재민들이 즐비했다. 집을 빠져나온 이들은 호텔 측에서 준 이불을 반으로 포개 뒤집어쓴 채 자고 있었다. 일본 이불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것보다 사이즈가 크다.
 |
| 호텔 입구 로비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이재민들이다. |
 |
| 버스 운행이 끊겼음을 알리는 안내문이다. |
첫째, 대중교통이 완전 마비된다.
둘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먹을 것이 부족해져 마트나 편의점이 순식간이 동난다. 후진국의 경우 당연히 약탈이 일어나겠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
셋째, 식수도 구하기 힘들어진다.
넷째, 음식점을 비롯해 생활필수품 공급 상점이 일제히 문을 닫는다. 이것은 그 상점 역시 붕괴되기에 당연한 소리다.
다섯째, 가스누출 사고 위험 때문에 전기·가스 공급이 끊어져 가정에서 취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여섯째, 휘발유나 디젤처럼 차량용 에너지 공급이 한정된다. 일본의 경우 1인당 10L만 허용됐다.
일곱째, 여진이나 제2의 쓰나미 때문에 행동반경이 위축된다.
여덟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조·구호 활동이 늦어질 경우 연로자나 어린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
아홉째, 붕괴 위험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집에서 잘 수 없어 노숙(露宿)을 할 수밖에 없다.
열째, 은행이나 현금자동인출기 등이 멈춰 현금이 없을 경우 속수무책이 된다.
열한번째, 언론인들조차 생명에 위협을 느껴 취재를 마다하게 된다. 실제로 당시 현장에 있던 한국 기자들이 그랬다. 그렇다면 뉴스가 끊어져 더욱 공포감이 조장된다.
 |
| 모든 것이 사라진 건물 안에서 한 주민이 밖을 내다보고 있다. |
 |
| 생필품 공급이 끊기자 수퍼마켓의 물건들도 순식간에 동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