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자, 《서경》 편찬하고 《춘추》 지은 중국 역사학의 뿌리
⊙ 사마천, 승, 도올, 춘추 등 중국 역사서의 전통 계승
⊙ 아버지 사마담에게서 도가(황로학)에 대한 이해 배우고, 동중서·공안국 등 유가들에게 배워
⊙ 중(中)과 정(正)을 잡아 쥐고 일을 기록하는 사람이 바로 사관(史官)
이한우
1961년생. 고려대 영문학과 졸업, 同 대학원 철학과 석사, 한국외국어대 철학과 박사 과정 수료 / 前 《조선일보》 문화부장, 단국대 인문아카데미 주임교수 역임
[연재를 시작하며]
국내외 정세가 혼돈(混沌)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으로 암울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권력 놀음에 빠져 있어 국민들은 공자 말대로 손발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나라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은 사라진 지 오래다. 2025년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8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우리 조상과 선배들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가난을 극복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으며 민주국가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정파, 지역, 계층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온전한 나라 역사 이야기를 내팽개친 채 각자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럴 때 역사를 읽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지혜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한(漢)나라가 크게 융성했다가 쇠퇴기로 접어들려는 초입에 거시적으로 역사를 그려낸 사마천(司馬遷)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 필자는 최근에 사마천의 《사기(史記)》와 삼가주(三家注) 번역을 마치고 출판을 기다리고 있다. 8년에 걸친 번역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사마천의 사상적 번민과 고투를 무엇보다 《월간조선》 독자와 먼저 나누고자 책 출간에 앞서 사마천의 《사기》를 깊이 있고 입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지혜를 전하고자 연재를 시작한다.
⊙ 사마천, 승, 도올, 춘추 등 중국 역사서의 전통 계승
⊙ 아버지 사마담에게서 도가(황로학)에 대한 이해 배우고, 동중서·공안국 등 유가들에게 배워
⊙ 중(中)과 정(正)을 잡아 쥐고 일을 기록하는 사람이 바로 사관(史官)
이한우
1961년생. 고려대 영문학과 졸업, 同 대학원 철학과 석사, 한국외국어대 철학과 박사 과정 수료 / 前 《조선일보》 문화부장, 단국대 인문아카데미 주임교수 역임
[연재를 시작하며]
국내외 정세가 혼돈(混沌)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으로 암울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권력 놀음에 빠져 있어 국민들은 공자 말대로 손발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나라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은 사라진 지 오래다. 2025년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8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우리 조상과 선배들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가난을 극복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으며 민주국가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고 정파, 지역, 계층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온전한 나라 역사 이야기를 내팽개친 채 각자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럴 때 역사를 읽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지혜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한(漢)나라가 크게 융성했다가 쇠퇴기로 접어들려는 초입에 거시적으로 역사를 그려낸 사마천(司馬遷)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 필자는 최근에 사마천의 《사기(史記)》와 삼가주(三家注) 번역을 마치고 출판을 기다리고 있다. 8년에 걸친 번역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사마천의 사상적 번민과 고투를 무엇보다 《월간조선》 독자와 먼저 나누고자 책 출간에 앞서 사마천의 《사기》를 깊이 있고 입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지혜를 전하고자 연재를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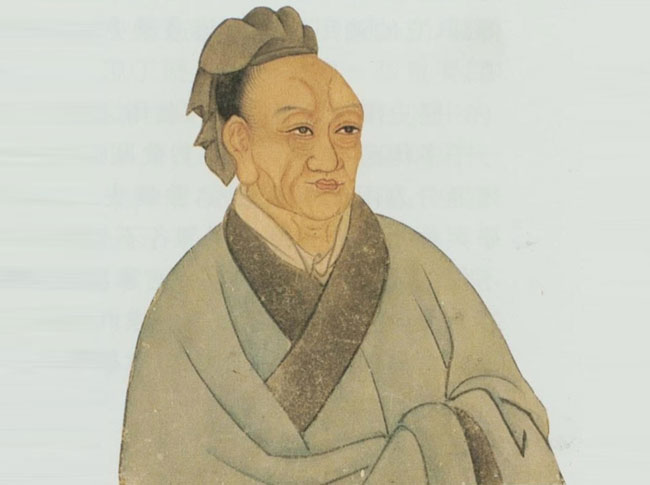
- 사마천
최근 필자는 《이한우의 논어 강의》라는 책을 냈다.
철학과를 다니면서 동양철학에서 간헐적으로 언급되는 공자(孔子)를 만나기는 했어도 지난 20여 년간 오로지 《논어(論語)》라는 텍스트 하나만 파고든 경험으로 볼 때 그때 만난 ‘사상가’나 ‘철학자’ 공자는 공자의 본모습이라 할 수 없다. 이제 그가 저술하거나 편찬한 책들을 남김없이 다 읽고 책도 내고 하다 보니 어렴풋하게나마 공자에 대한 하나의 상(像)이 떠오르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역사가’ 공자다. 《논어》 위령공(衛靈公)에 나오는 다음 두 구절은 곧바로 역사를 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를 말하고 있다.
〈공자가 말했다.
“내가 사람에 대해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기릴 것인가? 만약에 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를 시험해 본 바가 있어서이다.
이 백성들이다! 하은주(夏殷周) 삼대가 도리를 곧게 하고서 그 도리를 행한 까닭은.”〉
먼저 포폄(褒貶)의 도리를 말하고 이어 역사 평가의 기본적인 잣대는 백성의 입장임을 말한 것이다.
〈공자가 말했다.
“나는 오히려 (옛날 역사서에서) 사관(史官)이 (의심스러운 내용은) 글을 빼놓고 기록하지 않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구나!”〉
역사 기록은 실록(實錄), 즉 명확한 사실의 기록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신공양에서 人文으로
 |
| 공자 |
은(殷)나라, 즉 상(商)나라에서는 인신공양(人身供養) 제사가 광범위하게 펼쳐졌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이뤄진 고고학 발굴은 이 점을 방증하고 있다. 마치 남아메리카 아즈텍제국에서 일어났던 인신공양과 흡사하다. 리숴는 실제로 멜 깁슨 감독의 영화 〈아포칼립토〉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한다.
문제는 주(周)나라가 상나라를 물리치고 나서 철저하게 상나라의 이 같은 인신공양 흔적을 지우려 했다는 가설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문왕(文王)이나 주공(周公)의 모습은 뒤로 물러나고 인신공양을 위해 동원되었던 문왕, 이런 야만성을 제거하기 위해 인신공양의 정신적 배경이 되었던 신권(神權)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인간 중심의 인문(人文)으로 대체하려 했던 주공이 전면에 부각된다. 그리고 500년 후의 공자는 상나라에 뿌리를 둔 역사학자로서 주공이 하려 했던 지적(知的) 작업을 이어받아 《서경(書經)》(혹은 《상서(尙書)》)과 《춘추(春秋)》를 비롯한 각종 책을 편찬했다고 말한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대목이다.
이 가설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로 저자는 《역경(易經)》, 즉 《주역(周易)》을 끌어들인다. 흔히 《역(易)》에 말을 단 사람은 문왕, 주공, 공자 세 사람이 지목된다. 문왕은 64개 괘(卦)에 대한 짧은 글을 달았는데 이를 단사(彖辭)라고 한다. 주공은 64개 괘마다 있는 6개 효(爻)에 대해 모두 384개의 글을 달았는데 이를 효사(爻辭)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역경(易經)》이다. 이어 공자는 단사를 풀어낸 단전(彖傳)과 효사를 풀어낸 소상전(小象傳)을 썼다. 이밖에도 총론인 계사전(繫辭傳), 괘의 순서에 담긴 의미를 풀어낸 서괘전(序卦傳), 각 괘의 의미를 풀어낸 설괘전(說卦傳), 대비되는 괘의 의미를 풀어낸 잡괘전(雜卦傳), 64개 괘에 담긴 제왕의 자세를 독자적으로 풀어낸 대상전(大象傳), 그리고 64개 괘 중에서 건괘와 곤괘에서 미완성으로 끝난 문언전(文言傳)이 있다. 이를 십익(十翼)이라고 하는데 경(經)을 풀어낸 10가지 전(傳)이라는 뜻이다. 고대 중국에서 책의 권위는 경(經) 다음에 전(傳), 전 다음에 서(書)의 순서로 내려왔다.
다시 《상나라 정벌》로 돌아가자. 저자는 문왕의 단사에는 문왕 자신의 역사적 체험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상나라 말기의 인신공양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역》에 자주 등장하는 부(孚)란 글자를 지금은 미더움[信]과 같은 뜻으로 보는데 저자는 상나라 갑골문에 입각해 그것을 ‘포로’라고 본다. 하긴 부(俘) 자는 지금도 ‘사로잡다’ ‘포로’라는 뜻이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저자 리숴는 《역경》 전체를 갖고서도 그것이 문왕의 개인 체험이며 주공은 그런 점을 숨기려 했다는 것을 충분히 체계적으로 입증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당한 개연성을 주는 것만으로도 학술적 의미는 적지 않다고 하겠다.
上古 시대를 다룬 역사서 《서경》
이제 《상나라 정벌》에서 벗어나보자. 공자의 대표적 저술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누가 보아도 《춘추》일 것이다. 《주역》은 그가 지은 것이 아닌 보충 해설한 데 불과하고 《논어》는 먼 훗날 미지(未知)의 천재 에디터가 특정 목적으로 편집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역사학의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편찬물은 《서경》이다.
《춘추》는 공자 말년의 작품이지만 《논어》 술이(述而)편에서 “공자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하시던 말씀은 《시경》과 《서경》 그리고 일에 임해서 집행하는 예(禮)였으니 이는 다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다”라고 한 것을 감안하면 이미 《서경》은 일찍부터 편찬하여 교재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당나라 역사학자 유지기(劉知幾·661~721년)는 《사통통석(史通通釋)》(소명출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자는 주나라 왕실의 도서들을 보면서 우(虞), 하(夏), 상(商), 주(周) 4대의 전적(典籍)을 얻어 그중에서 훌륭한 것들을 골라 《상서(尙書)》 100편을 편정(編定)하였다.”
다만 《서경》은 당우(唐虞), 즉 요순(堯舜)에서 시작하는 역사서임에 분명하지만 연대(年代)가 나오지 않고 사건(事件) 또한 나오지 않는다. 오직 군신(君臣) 사이에 오간 말만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서(書)란 역사였으니 《서경》이란 역사의 정종(正宗·원류)임을 뜻하는 것이다. 《상서》라고도 하는데 이 또한 상고(尙古·上古) 시대 역사라는 뜻이다.
또 중국 역사의 기원을 요순에 둔 것 또한 《서경》이니 이 또한 공자의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사마천은 그러나 그 기원을 더 위로, 황제(黃帝)에게로까지 끌어올린다.
이른바 중국 24사(史) 중에도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진서(晉書)》 《송서(宋書)》 《남제서(南齊書)》 《양서(梁書)》 《진서(陣書)》 《위서(魏書)》 《북제서(北齊書)》 《주서(周書)》 《수서(隋書)》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 13개 역사서가 서(書)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그다음으로 송사(宋史), 명사(明史) 식으로 한 것들이 9개 있고 유일하게 삼국지(三國志)가 있다. 여기에 사마천의 《사기(史記)》를 더하면 모두 24사가 된다. 《사기》의 원래 이름도 실은 《태사공서(太史公書)》였으니 태사공이 지은 역사라는 말이다.
공자가 《춘추》를 저술한 목적
이제 《춘추》를 말할 차례다. 《춘추》는 노나라 은공(隱公)부터 애공(哀公)까지 242년의 사적(事跡)을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다. 공자가 《춘추》를 저술한 목적은 다름 아닌 ‘군군신신(君君臣臣) 부부자자(父父子子)’의 정신이 살아 있는 공동체 회복이었다. 이는 《춘추》를 집필하는 대의(大義), 즉 난신적자(亂臣賊子)를 역사 기록에 남겨 주벌(誅罰)하겠다는 정신과 그대로 통한다. 난신(亂臣)이란 신하답지 못한 신하[不臣]이고 적자(賊子)란 자식답지 못한 자식[不子]이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은 미언대의(微言大義)였다. 말은 미미한 듯해도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크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공자는 《춘추》에 “허(許)나라 세자 지(止)가 자기 (아버지이자) 임금 매(買)를 시해했다”고 적었다. 임금이나 아버지를 죽이는 것은 살(殺)이 아니고 시(弑)라 했다.
그런데 《춘추》를 역사적 사실로 보충한 《춘추좌씨전》이 전하는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로 칼로 시해한 것이 아니라 “허나라 도공이 학질에 걸리자 세자 지가 올린 약을 마시고 죽었다”고 되어 있다. 세자가 독약을 올리거나 일부러 잘못된 약을 올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공자가 《춘추》에 “자기 임금을 시해했다”고 기록한 것은 미리 약을 시험 삼아 맛보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부모님이 병이 있어 약을 드실 때는 자식이 먼저 그것을 맛보는 것이 예(禮)다. 또 3대에 걸쳐 의원을 해온 사람이 아니면 그 의원이 지은 약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는 《예기(禮記)》에 나오는 일의 이치[事理=禮]다. 공자는 이런 이치에 입각해 그의 자자(子子), 즉 자식이 자식다운지를 판별했고 결국 자식답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고서 “세자 지가 아버지이자 임금을 시해했다”고 짤막하게 기록한 것이다. 그렇다면 《논어》에 수없이 등장하는 사리(事理)에 관한 언급 또한 역사를 서술하고 인물을 평가하는 잣대인 셈이다.
역사가란 이처럼 일정한 역사 서술 원칙에 입각해 일의 이치를 점검해 가면서 지난 일을 기록해야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공자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중·일 역사가의 원조다.
‘시가 쇠퇴했다’는 의미
《맹자(孟子)》 이루장구(離婁章句)에 나오는 말이다.
〈맹자가 말했다.
“제대로 임금다운 임금[王者]의 행적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끝나자 시(詩)도 함께 쇠퇴해 버렸다. 이처럼 시가 쇠퇴한 이후에 (공자께서) 《춘추》를 지으셨다.
진(晉)나라의 《승(乘)》, 초(楚)나라의 《도올(檮杌)》, 노(魯)나라의 《춘추(春秋)》는 모두 (자국의 역사책으로) 똑같은 것이다. 거기에 기록된 일들은 제(齊)나라 환공(桓公), 진나라 문공의 업적에 관한 것들이며 그 서술 방식과 문체는 사관(史官)의 문체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관들이 역사책을 쓰는) 그 의리의 정신을 나는 슬쩍[竊] 빌려다 썼다.’”〉
주(周)나라는 유왕(幽王)대에 이르러 국력이 쇠퇴하여 이후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게 되고[東遷] 천자의 권위가 떨어져 제후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춘추(春秋) 시대의 시작이다. 임금다운 임금의 행적이 끝났다는 맹자의 말은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이제 맹자의 말을 풀어보자.
“제대로 임금다운 임금의 행적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끝나자 시도 함께 쇠퇴해 버렸다. 이처럼 시가 쇠퇴한 이후에 (공자께서) 《춘추》를 지으셨다.”
이 말은 간단히 풀이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 너무나도 중대한 전환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시(詩)와 역사[史],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경》과 《춘추》의 관계를 추출해 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의 시를 말하기에 임금다운 임금의 행적이 끊어지자 시도 함께 쇠퇴해 버렸다고 말하는 것일까?
먼저 여기서 말하는 시의 발단부터 살피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서경》 하서(夏書)에는 기(夔)가 음악을 짓고 순임금이 가사를 붙이는 대목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시의 출발점으로 본다. 고대 중국에서 시는 성군(聖君)의 통치 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돼 시작됐다. 이후 천자는 제후국을 순행하면서 그때마다 각 지방의 풍속과 행정을 보살폈고 이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방별 민심이 담긴 시가(詩歌)를 수집하여 편찬했다. 그중에서 고르고 고른 것이 바로 《시경》이다. 따라서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천자가 더 이상 제후국을 순회할 수 없게 되면서 시가를 수집하는 일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시가 쇠퇴했다’는 것은 곧 천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서 세상에서 도리가 없어졌다는 뜻이다.
《승》 《도올》 《춘추》
이처럼 세상에 도리가 없는[天下無道] 상황에서 도리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자가 주목한 것이 다름 아닌 역사[史=春秋]다. 공자의 역사책 《춘추》에 시대 비판 정신이 담기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 비롯된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서 맹자의 말을 살펴보자.
“진나라의 《승》, 초나라의 《도올》, 노나라의 《춘추》는 모두 (자국의 역사책으로) 똑같은 것이다. 거기(춘추)에 기록된 일들은 제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의 업적에 관한 것들이며 그 서술 방식과 문체는 사관의 문체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관들이 역사책을 쓰는) 그 의리의 정신을 나는 슬쩍 빌려다 썼다.’”
사관의 문체란 다름 아닌 역사 서술 문체[春秋筆法]를 말한다. 시문(詩文)의 문체가 아니라 진나라의 《승》, 초나라의 《도올》, 노나라의 《춘추》에 담긴 역사 서술 문체를 기본으로 해 자신(공자)의 《춘추》를 지었다는 말이다.
《춘추정의소(春秋正義疏)》의 저자인 당나라 학자 공영달(孔穎達·574~648년)은 이렇게 풀이한다.
“춘추(春秋)란 말은 원래 각국의 역사책[史書]을 가리키는 보통명사였다. 즉 연(燕)나라에는 연의 춘추가 있었고 송나라에는 송의 춘추가 있었다. 진(晉)나라의 춘추를 승이라고 부른 이유는 거기에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간에 무엇이나 다 실어서 기록해 두었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고, 초나라의 춘추를 도올이라고 불렀던 것은, 도올은 원래 못된 짐승의 이름으로서 악한 일들을 기록해 둠으로써 악을 경계하고 선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한편 한 나라의 역사서를 춘추라 부른 까닭은 1년에 춘하추동(春夏秋冬)의 4계절이 있으며 이 4계절 동안 만물의 생육 번성 등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없는 것처럼, 한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도 모든 일이 다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역사와 사계절의 유사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것을 춘하추동, 즉 춘추라 불렀던 것이다.”
도올은 고대 중국에서 역사서 외에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됐다. 하나는 성질이 못된 짐승[惡獸]을 뜻하고 또 하나는 가르쳐도 되지 않고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재주 없는 인간[不才者]을 사람들이 욕하며 불렀던 말이다.
1. 아버지 사마담
- 도가이면서 유학 배우게 해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司馬談·?~기원전 110년)은 당도(唐都)에게 천문을 배우고 양하(楊何)에게 《주역》을 배웠으며 황생(黃生)을 통해 도론(道論)을 익혔다. 도론이란 황로학(黃老學)을 말한다.
한나라 문제(文帝) 때는 황로학이 절정기를 맞고 있었다. 그런데 아들 경제(景帝) 때에 이르러 경제가 조금씩 유학(儒學)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머니 두(竇)태후는 황로를 독실하게 숭상했다. 이때 시경(詩經) 박사 원고생(轅固生)이 경제 면전에서 황생과 논쟁을 벌였다. 유가(儒家)와 도가(道家)의 사상 투쟁이었다. 이 논쟁은 《사기》 〈유림열전(儒林列傳)〉에 실려 있다.
유가와 황로학
황생이 말했다.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은 천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군주를 시해한 것입니다.”
원고생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하나라의) 걸왕(桀王)과 (은나라의) 주왕(紂王)은 황음에 젖어 어지러웠기에 천하의 마음이 모두 탕과 무로 돌아간 것이니 탕과 무는 천하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걸과 주를 토벌했던 것이고 걸과 주의 백성들은 자기 군주의 부림을 받지 않고 탕과 무에게 귀순했기 때문에 탕과 무는 어쩔 수 없이 천자로 즉위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천명을 받은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황생이 말했다.
“‘모자는 아무리 낡아 해어져도 반드시 머리 위에 써야 하고 신발은 아무리 새것이라 해도 반드시 발아래에 신어야 한다’라고 했으니 어째서이겠습니까? 위와 아래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걸왕과 주왕이 비록 도리를 잃었지만 그래도 군주로 윗자리에 있었습니다. 탕왕과 무왕이 비록 빼어났지만[聖] 신하로 아랫자리에 있었습니다. 대개 군주가 어긋나게 행동하면 신하가 바른말로 그 잘못을 바로잡아 천자를 받들었어야 하는데 도리어 잘못을 트집 잡아 군주를 주살하고 그 대신 남면(南面)하여 왕으로 즉위한 것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원고생이 말했다.
“반드시 당신이 말한 바대로라면 이는 고황제(高皇帝·유방)께서 진(秦)나라를 대신해 천자의 자리에 오른 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이에 경제가 말했다.
“고기를 먹으면서 말의 간을 먹지 않는다고 고기 맛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가? 학자들이 탕왕과 무왕이 천명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드디어 논쟁을 마쳤다. 이 뒤로는 학자들 중에 감히 수명(受命)과 방살(放殺·추방이나 시해)에 대해 밝혀서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에 두태후는 원고생을 불러 반격을 가한다.
두태후는 노자(老子)의 글을 좋아하여 원고생을 불러 이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고가 말했다.
“이는 집안 심부름꾼들의 말일 뿐입니다.”
태후가 화를 내며 말하였다.
“어떻게든지 사공(司空·토목 건축 담당)의 성단서(城旦書·축성 현장의 노역자 명령서)를 받아내리라!”
마침내 고에게 우리에 들어가 돼지를 찔러 죽이게 하였다. 경제는 태후가 화가 났지만 고는 곧은 말을 한 것일 뿐 죄가 없다고 여겨 고에게 날카로운 병기를 빌려주었다. 우리로 내려간 고는 단칼에 돼지의 심장을 찔러 쓰러뜨렸다. 태후는 가만히 있다가 다시 죄를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그냥 두었다.
이런 싸움은 무제 초기에 더욱 격화되었다. 사마담은 무제(武帝) 건원(建元) 연간에 천문과 역사를 책임지는 태사령(太史令)에 올랐다. 본인은 도론이었지만 이런 논쟁과 이념 투쟁을 직접 목도하면서 유학이 장차 융성하리라 보고서 아들 사마천은 당시 유학의 두 대가인 동중서(董仲舒)와 공안국(孔安國)에게 보내 유학을 익히게 했다. 자기는 도론을 견지했지만 아들에게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이다. 사마천은 훗날 유학으로 전향하지만 아버지의 영향으로 황로학에 대해서도 열린 시각을 갖는다.
특히 《주역》에 대한 사마천의 조예(造詣)는 명백히 아버지 사마담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2. 스승 동중서
- 유학으로 사상 통일 이루고 사마천에게 《춘추》 가르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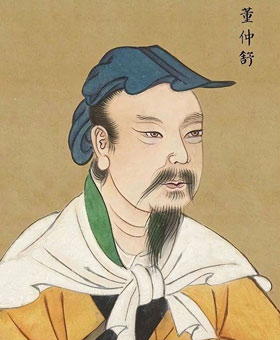 |
| 동중서 |
〈태사공(太史公·사마천)이 말했다.
“저는 동생(董生·동중서)에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나라의 도리가 폐기되었을 때 공자가 노나라 사구(司寇)가 되었는데 제후들은 공자를 해치려 하고 대부들은 공자를 가로막았다[壅]. 공자는 자신이 쓰일 때가 아니고 도리가 행하여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노나라의) 242년 동안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림으로써 천하를 위한 본보기[儀表]를 만들어 (잘못된) 천자들을 깎아내리고[貶] (잘못된) 제후들을 뒤로 물리고[退] (잘못된) 대부들을 성토하여[討] 임금다운 도리[王事·王道]에 이르렀을 뿐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원래는) 추상적인 말로[空言] 그 일들을 싣고 싶었으나 이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보여주어 아주 절절하고[深切] 훤하게 밝히는 것[著明]만 못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춘추》는 위로는 삼왕(三王)의 도리를 밝히고 아래로는 사람의 일[人事]의 큰 틀과 작은 벼리들[經紀=綱紀]을 가려내어 이로써 의심스러운 바를 분별하였고[別嫌疑] 옳고 그름을 밝혔으며[明是非] 그동안 정하지 못하고 유예했던 것들을 판정하였습니다[定猶豫]. (이렇게 하여) 좋은 사람이나 일을 좋다고 하고 나쁜 사람이나 일을 나쁘다고 하였고[善善惡惡] 뛰어난 사람을 뛰어나다 하고 못난 사람을 낮췄으며[賢賢賤不肖] 망한 나라를 존속하게 하고[存亡國] 끊어진 (왕실) 집안을 이어주었고[繼絶世](이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제사를 지낼 후사를 정해줌으로써 그렇게 했다는 뜻이다) 무너진 전통을 보완하고 폐기된 전통은 다시 일으켰으니 이것들은 다 임금다운 도리의 큰 일[王道之大]입니다.
《주역》은 하늘과 땅, 음과 양, 사계절, 오행(五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變]에 대해 장점이 있고 《예기(禮記)》는 사람의 큰 도리[人倫]를 크고 작은 벼리로 잡아주기[綱紀] 때문에 행실[行]에 대해 장점이 있으며 《서경》은 옛 임금들의 일과 행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사[政]에 장점이 있고 《시경》은 산천, 계곡, 금수, 초목, (짐승의) 암놈과 수놈[牝牡], (새의) 암컷과 수컷[雌雄]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풍자적 은유[風=諷諭]에 장점이 있으며 《악기(樂記)》는 몸을 세우는 까닭을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조화[和]를 이루는 데 장점이 있고 《춘추》는 옳고 그름을 가려주기 때문에 사람을 다스리는 데[治人]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로써 사람에게 절도(節度)를 부여해 주고 《악기》로써 조화로움을 불러일으키며 《서경》으로써 사실을 말하고 《시경》으로써 뜻(이나 감정)을 전달하며 《주역》으로써 변화를 말하고 《춘추》로써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춘추》는 그 문자가 수만 자로 이뤄져 있고 그 뜻하는 바도 수천 가지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려[發=治] 그것을 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춘추》만큼 가까운 것은 없습니다[撥亂世反之正 莫近於春秋](이 표현은 《춘추 공양전(春秋公羊傳)》에 나온다. 반정(反正)이란 말도 여기서 나온 것이다). 만 가지 일과 사물이 흩어지고 모이는 것이 다 《춘추》에 있습니다. 《춘추》 안에는 임금을 시해한 것이 36건이고 나라를 망친 것이 52건이며 제후들이 망명하여 사직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경우는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까닭을 잘 들여다보면 모두 다 그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역》에 이르기를 ‘털끝만 한 작은 차이도 (뒤에 가서는) 천리나 오차가 날 수 있다’라고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은 하루아침, 하루저녁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오래 쌓여서[漸久]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천자건 임금이건) 나라를 소유한 자는 《춘추》를 잘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이를 모르면) 바로 앞에서 (다른 동료를) 중상모략을 하여도 보지를 못하고 뒤에서 해를 끼쳐도 이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신하 된 자도 《춘추》를 잘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이를 모르면) 늘상 있는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 마땅함[宜=義]을 알지 못하고 변고가 일어났을 때는 그에 맞는 대처법[權=權變=權道]을 알지 못합니다.
임금이나 아버지가 되어 《춘추》의 마땅함에 능통하지 못하면 반드시 가장 나쁜[首惡=元兇] 오명을 덮어쓰게 될 것이고 신하나 자식이 되어 《춘추》의 마땅함에 능통하지 못하면 반드시 찬탈이나 시역(弑逆)을 저지르다가 주살당하게 되는 죄를 지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다 자신들이 하는 짓을 좋은 것이라 여기고 행하지만 그것의 마땅함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실상과는 동떨어진 비난[空言]을 덮어쓰면서도 감히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무릇 일의 이치와 마땅함[禮義]의 기본적인 뜻에 통하지 못하면 임금은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답지 못하고 자식은 자식답지 못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임금의 일을 신하에게) 침범당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면 (결국은) 주살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면 무도하게 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면 불효를 하게 되니 이 네 가지 행실은 천하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을 뒤집어쓰게 되어도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할 뿐 감히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추》란 일의 이치와 마땅함의 가장 큰 으뜸[大宗]인 것입니다. 무릇 예(禮)란 어떤 일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금하는 것이요 법이란 이미 일어난 후에 시행하는 것이어서 법의 효용은 쉽게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예가 금하는 것은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3. 스승 공안국
- 사마천에게 《상서》 가르쳐
 |
| 공안국 |
〈사마천 또한 공안국에게 가서 뜻을 캐물었다. 천(遷)은 그의 책에 요전(堯典), 우공(禹貢), 홍범(洪範), 미자(微子), 금등(金縢) 등의 여러 편을 실으면서 고문의 학설을 많이 받아들였다.〉
사마천이 동중서와 공안국에게 나아가 학문을 전수받은 것은 20대 초반이다. 그가 장유(壯遊), 즉 첫 번째 천하주유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다. 이미 아버지 사마담을 통해 사가(史家)의 길을 가도록 길러진 그는 세상 구경을 마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역사 서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춘추》와 《서경》을 당대 최고 학자들에게 배웠던 것이다.
사마천은 스무 살에 장유에 나섰다. 3년에 걸친 이 여행에서 사마천은 공자의 땅을 찾아간다. 《태사공 자서》의 한 대목이다.
〈“또 북쪽으로 문수(汶水)와 사수(泗水)[두 강 모두 연주(兗州)에서 발원해 남쪽으로 흘러 노나라를 지나간다]를 건너 제나라와 노나라 도읍에서 학업을 연마하며[講業] 공자가 남긴 풍습을 살펴보았고 추(鄒)와 역(嶧)에서는 향사(鄕射)를 구경했다[추(鄒)는 현(縣)의 이름이고 역(嶧)은 산의 이름이다. 근처에 곡부(曲阜) 땅이 있는데 여기서 향사의 예가 행해졌다].”〉
맹자는 《맹자》 이루장구(離婁章句)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직접적으로) 공자의 제자가 될 수는 없었지만 여러 사람을 통해 개인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私淑].”
사숙(私淑)이란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어떤 위대한 인물을 본받아서 도리와 학문을 닦는다는 뜻으로 《맹자》에 연원을 둔 말이다. 사마천 또한 공자를 사숙하였고 그를 높였다. 이는 사마천이 공자를 열전(列傳)이 아니라 제후들의 사적을 기록하는 세가(世家)에 둠으로써 분명히 드러난다. 사마천은 ‘공자세가(孔子世家)’를 끝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시경》에 이르기를 ‘높은 산처럼 우러러보고, 큰길처럼 따라간다[高山仰止 景行行止·《시경》 소아(小雅) 거할(車轄)편에 나오는 구절]’라고 했다. 비록 그 경지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그곳을 향하고 있다. 나는 공자의 글을 읽을 때마다 그 사람됨을 생각했다. 노나라에 가서 중니의 사당에서 수레, 의복, 예기를 보았고, 유생들이 때마다 그 집에서 예를 익히는 것도 보았는데 나는 공경심에서 그곳을 배회하며 떠날 수가 없었다. 천하에는 군왕부터 뛰어난 이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있는데 모두 그 당시에는 영화를 누렸지만 죽으면 그만이었다. 공자는 포의(布衣)였지만 10여 대가 지나도록 배우는 자들이 떠받들고 있다. 천자 왕후는 물론 중국에서 육례(六禮)를 말하는 자들은 모두 공자에게서 그 척도를 찾고 있으니 공자는 지극한 빼어남[至聖]이라고 할 만하도다!”
사마천은 그중에도 사(史)를 매개로 공자를 사숙했다. 사란 고대 한자어로는 중(中)을 두 손으로 잡아 쥐는 모양이다. 허신(許愼)은 《설문(說文)》에서 “사는 일을 기록하는 사람이다. 중(中·적중함)을 잡은 것이다. 중은 바르다[正]는 뜻이다”라고 했다. 즉 중(中)과 정(正)을 잡아 쥐고 일을 기록하는 사람이 바로 사관(史官)이다.
사마천 역사정신의 뿌리는 《주역》
이런 사마천의 머리와 마음속에 스승 동중서나 공안국 이상으로 공자를 각인시켜 준 인물은 다름 아닌 아버지 사마담이다. 《태사공 자서》의 한 대목이다.
〈태사공이 말했다.
“선친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공(周公)이 세상을 뜨고 500년 만에 공자께서 나오셨고 공자가 세상을 뜨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500년이 지났다. 이제 누가 그것을 이어받아 《역전(易傳)》을 바로잡고 《춘추》를 잇고, 《시(詩)》 《서(書)》 《예(禮)》 《악(樂)》의 원류[際]를 밝힐 수 있을까?’라고 하셨다. 아버지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소자가 어찌 감히 사양하리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정역전(正易傳)이다. 사마담은 역사가로서 사마천의 출발점을 정역전이라고 했다. 정역(正易)이 아니라 정역전이라고 했다. 《역경》 혹은 《주역》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역경》 혹은 《주역》에 대한 해석을 바로잡는다는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역전(易傳)이란 다름 아닌 공자의 《주역》 풀이, 즉 십익(十翼)을 가리킨다. 정(正)은 바르다, 바로잡다 외에도 다스리다, 바르게 파악하다 등의 뜻도 있다. 그렇다면 사마담의 이 말은 아들 사마천이 공자의 역전에 담긴 깊은 뜻을 바르게 파악하여 그러한 정신으로 역사를 써내려 가라는 당부인 셈이다.
지금의 중국 산시성(陝西省) 한청(韓城), 그의 고향에는 그의 무덤과 사당이 있는데 사당 입구에는 ‘사필소세(史筆昭世)’라는 글씨가 내걸려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역사의 붓으로 세상을 밝힌다는 말이다. 사진으로 본 그의 무덤은 독특한데, 몽골 빠오 형태를 하고 있으며 주변은 벽돌로 에워싸 둥근 테두리에 《주역》의 팔괘(八卦)를 새기고 그 사이사이에는 각종 꽃을 새겨놓았다. 후대에 무덤을 조성한 사람들이 사마천의 역사정신은 무엇보다 《주역》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이 이야기는 기전체(紀傳體)라는 획기적인 역사 서술 방법을 다룰 때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