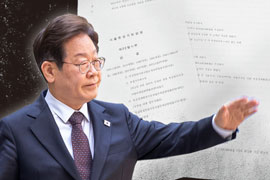⊙ “子弟들을 위해 恩澤 구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卒한 후 보니 집안에 남은 곡식이 없었다”(실록)
⊙ 연산군 때 좌의정에 올랐으나, 연산군과 臺諫 사이에서 곤욕
⊙ 명나라와의 외교, 홍문관 대제학으로 이름 떨쳐
⊙ 아버지 어효첨은 이조판서, 동생 어세공은 형보다 앞서 공조·병조·형조·호조판서 역임
이한우
1961년생. 고려대 영문학과 졸업, 同 대학원 철학과 석사, 한국외국어대 철학과 박사 과정 수료 / 前 《조선일보》 문화부장, 단국대 인문아카데미 주임교수 역임
⊙ 연산군 때 좌의정에 올랐으나, 연산군과 臺諫 사이에서 곤욕
⊙ 명나라와의 외교, 홍문관 대제학으로 이름 떨쳐
⊙ 아버지 어효첨은 이조판서, 동생 어세공은 형보다 앞서 공조·병조·형조·호조판서 역임
이한우
1961년생. 고려대 영문학과 졸업, 同 대학원 철학과 석사, 한국외국어대 철학과 박사 과정 수료 / 前 《조선일보》 문화부장, 단국대 인문아카데미 주임교수 역임
어세겸(魚世謙·1430~1500년) 집안은 할아버지 어변갑(魚變甲·1381~ 1435년) 때부터 현달하기 시작한다. 어변갑은 태종 8년 문과에서 장원급제했고 세종 때 집현전이 생기자 응교, 지제교 등을 거쳐 1424년 직제학에 이르렀다. 이때 그는 정인지(鄭麟趾)와 나란히 벼슬살이를 했다. 그런데 어변갑은 직제학을 끝으로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후 세종은 그의 효심을 아름답게 여겨 세종 14년(1432년) 사간원 지사로 삼기 위해 그를 불렀으나 끝내 취임하지 않았다.
어세겸의 아버지 어효첨(魚孝瞻·1405~1475년)은 아버지 어변갑의 학문과 곧은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했던 어효첨은 세종 11년(1429년) 문과에 급제해 얼마 후부터 아버지 어변갑과 마찬가지로 집현전에서 경력을 쌓았다. 세종·문종 등이 모두 그의 학문을 극찬했고 세조 때 이조·호조·형조·공조참판과 대사헌을 역임했다. 이 당시 세조는 신하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어효첨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모두 실록에 기록된 일화다.
“이 사람은 내가 경중(敬重)하는 바이며 일찍이 세종에게 천거된 자이다.”
또 정2품 자헌대부로 승급시키면서 이렇게 말했다.
“경은 정직한 사람이다. 대신 중에 경의 아들 어세겸을 천거하는 자가 있으니 내가 집안 뜰의 가르침[家庭之訓]이 있음을 안다.”
과정지훈(過庭之訓)
세조가 말한 가정지훈(家庭之訓)은 아버지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인데 《논어》 계씨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일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강(陳亢)이 (공자 아들) 백어(伯魚)에게 물었다.
“그대는 특별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
(백어가) 대답했다.
“(그런 특별한 것은) 들은 적이 없다. 일찍이 홀로 서 계실 때 내가 종종걸음으로 뜰을 지나가는데[過庭] ‘시(詩)를 배웠느냐?’라고 물으시기에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고 했더니 ‘시를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시므로 내가 물러나와 시를 배웠다. 다른 날에 또 홀로 서 계실 때 종종걸음으로 뜰을 지나가는데 ‘예(禮)를 배웠느냐?’고 물으시기에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니 ‘예를 배우지 않으면 설 수 없다’고 하셨다. 나는 물러나와 예를 배웠다. 이 두 가지를 들었을 뿐이다.”
이에 진강이 물러나 기뻐하며 말했다.
“하나를 물어 세 가지를 얻었으니 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듣고 예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듣고 또 군자가 그 아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遠=公]을 들었구나!”〉
맹모삼천(孟母三遷)이 어머니로부터 받는 교훈임과 마찬가지로 과정지훈(過庭之訓)은 아버지로부터 받는 교훈이다. 세조가 말한 가정지훈(家庭之訓)은 바로 뜰을 지날 때 받는 아버지로부터의 가르침인 과정지훈(過庭之訓)과 같다.
어효첨은 세조 때 이조판서를 지냈으나 그 후 주로 중추원 지사, 판사, 영사를 지내면서 현실 정치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태종 때 좌의정 박은(朴訔)이 그의 장인이며 아들은 어세겸과 어세공(魚世恭·1432~1486년)을 두었다. 어효첨에 이르러 명문가로 자리 잡은 것이다.
순탄한 벼슬 생활
세조 2년(1456년) 동생 세공과 함께 문과에 급제한 어세겸은 순조롭게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가 승문원(承文院) 정자(正字)로 있던 세조 4년 5월 22일 세조는 어세겸 등을 불러 이렇게 말한다.
“국가에서 지금 너희를 선임한 것은 한훈(漢訓) 이문(吏文)을 정통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각각 그 업에 최선을 다하라.”
즉 중국어와 더불어 관리용 문자 이문에 일가견이 있었다. 이후 이듬해인 세조 5년 천추사(千秋使) 이극배(李克培)의 수행관원인 이문학관(吏文學官)이 되어 명(明)나라를 다녀온다. 학술과 문장에도 능했던 어세겸은 동생 세공과 함께 세조의 명을 받아 편찬한 《주역구결(周易口訣)》과 권근(權近)의 구결을 비교 토의하는 모임에도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문명(文名)을 얻게 된 어세겸은 예문관 대교(待敎), 봉상시 직장(直長), 성균관 주부(主簿), 예문관 봉교(奉敎) 등을 거치는데 모두 임금이 직무상 필요로 하는 글을 짓는 요직이었다. 이어 어세겸은 이조정랑을 거쳐 세조 13년(1467년) 8월 우부승지에 제수되고 이어 우승지에 이른다. 권부(權府) 핵심에 이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대 실력자 김국광(金國光)이나 한계희(韓繼禧) 등의 천거를 받기도 했다.
이런 어세겸에게도 살짝 위기가 찾아온다. 세조 14년 5월 1일 세조가 서현정(序賢亭)에 나아가 조정 신료와 종친들을 불러 활쏘기를 한 다음 술자리를 베풀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공조판서 남이(南怡)가 술에 취해 실언(失言)을 했다.
“상(上)께서는 구성군(龜城君) 이준(李浚)을 지나치게 사랑하시니 신은 남몰래 그것이 잘못이라고 여깁니다.”
이준은 세종 4남 임영대군의 아들이다. 세조의 조카다. 이시애의 난을 토평(討平)한 공로로 20대 때 영의정에 오를 정도로 세조의 총애를 받았다. 이미 이때 남이의 난이 예고된 셈이다.
화가 난 세조는 당장 남이를 옥에 가두었다. 그러고 여러 신하에게 “남이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 물었는데 모두 남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어세겸은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세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어세겸을 쓸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승지가 된 이후부터는 그 옳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어세겸은 기밀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 세조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다.
형보다 앞서간 동생 어세공
예종 1년(1469년) 남이 역모 사건이 일어났고 어세겸은 이를 다스리는 데 참여한 공로로 익대공신(翊戴功臣) 3등에 책록되고 함종군(咸從君)에 봉해졌다.
그런데 형 어세겸이 정3품 승지에 있을 때 동생 어세공은 이미 세조 말 정2품 병조판서에 오른다. 세조 13년(1467년) 이시애의 난이 일어나자 함길도 관찰사에 중용되어 난을 평정한 공으로 적개공신(敵愾功臣) 2등에 책록됐기 때문이다. 이후 아성군(牙城君) 어세공은 성종 때 공조·병조·형조·호조판서를 두루 지내고 재상에 이르는 계단이라 할 수 있는 의정부 우참찬에 이르렀는데 형보다 먼저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재상에 이르지는 못했다. 실록이 전하는 그의 졸기(卒記)다.
〈어세공은 영민(英敏)하여 복잡한 일을 잘 처리하였고, 무격(巫覡·미신)·부도(浮屠·불교)·지리(地理·풍수)의 구기(拘忌)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으며, 늘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 것을 일삼았으므로 남들이 그 효성에 감탄하였다. 다만 심정원(沈貞源)이 버린 아내에게 재산이 매우 많았는데, 이를 후처(後妻)로 삼았으므로 남들이 비루하게 여겨 비웃었다.〉
심정원은 세종의 장인 심온(沈溫)의 손자이자 소헌왕후의 동생 심결(沈決·1419~1470년)의 아들이다. 실록에 따르면 세조 9년(1463년) 정인지의 아들 공조정랑 정숭조(鄭崇祖)와 심결의 아들인 세자참군 심정원이 까닭 없이 아내를 버렸다 하여 조정으로부터 견책을 받은 일이 있었다.
성종 초 어세겸은 함종군 자격으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일을 주로 맡았다. 성종 1년(1470년) 5월 26일 어세겸은 홍제원에서 명나라 사신단을 송별하고 돌아와 이렇게 아뢴다.
“중국 부사가 말하기를 ‘전하의 춘추가 열넷이라고 하는데 말과 행동이 실수가 없고 또 총명형철(聰明瑩澈)하니 참으로 조선의 성군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성종 2년(1471년) 10월 23일 어세겸은 예조참판에 제수된다. 성종 3년, 성종이 인정전에 나아가 선비들에게 시험문제를 내는데 이때 독권관(讀券官)이 좌의정 최항(崔恒), 좌찬성 노사신(盧思愼), 그리고 예조참판 어세겸이었다.
성종 9년(1478년) 어세겸은 부총관에 제수된다. 그러나 동생 어세공이 병조판서였기에 형제가 함께 병권(兵權)을 쥐어서는 안 된다며 부총관 제수는 취소된다. 상피법(相避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다시 함종군 자격에 머물렀다. 하나 어세겸은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 10년(1479년) 2월 10일 도승지 홍귀달(洪貴達)이 성종에게 아뢰었다.
“이극돈(李克墩), 어세겸은 큰일을 맡길 만한데 지금 한산한 곳에 두었으니 신은 뛰어난 이를 등용하는 것이 지극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이에 성종은 “내가 마땅히 쓸 것이다”라고 답했다. 홍귀달은 당대 명신이었다. 실제로 3개월 후인 5월 11일 어세겸은 사헌부 대사헌에 제수된다. 그러나 다음 날 어세겸은 성종을 찾아가 아뢰었다.
“신의 아우 어세공이 지금 병조판서로 있습니다. 사헌부와 병조는 서로 분경(奔競)을 살피고 또 인사의 잘못을 탄핵하는 자리이니 신의 직책을 갈아주소서.”
이리하여 같은 날 한성부 좌윤으로 자리를 옮긴다. 일에는 민첩하고 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공자의 민어사(敏於事) 신어언(愼於言) 가르침을 실천하는 인물이었다. 같은 해 8월 1일 어세겸은 핵심 요직인 이조참판에 제수된다. 와중에도 그는 국가 현안이 있으면 북경으로 가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 돌아왔다. 이 무렵 태평을 누리는 임금과 신하의 훈훈한 장면 하나가 실록에 실려 있다.
《논어》 증점고슬도(曾點鼓瑟圖)에 대한 시를 짓다
성종 11년 10월 14일 성종은 병풍 12폭을 내어 문신 중에서 시에 능한 12명을 뽑아 각각 칠언율시 1편씩을 지어 올리게 했다. 어세겸은 《논어》에 나오는 증점고슬도(曾點鼓瑟圖)에 대한 시를 지어 올렸다. 증점이 비파를 켜는 장면은 선진(先進)편에 나온다.
〈자로(子路), 증석(曾晳), 염유(冉有), 공서화(公西華)가 공자를 모시고 앉아 있었다. 공자가 말했다.
“내가 너희보다 나이가 조금 많다고 하여 나에게 말하는 것을 어려워 마라. 평소에 너희는 말하기를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혹시 사람들이 너희를 알아준다면 어찌하겠느냐?”
자로가 경솔하게 나서 대답했다.
“전차 천 대를 가진 제후의 나라가 대국들 사이에 끼여 군사적 침략이 가해지고 그로 인하여 기근이 들게 되거든 제가 그 나라를 다스릴 경우 3년이 지나면 백성들을 용맹하게 하고 또 의리를 향해 나아가는 법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구(求)야,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염유가 대답했다.
“사방 넓이 60~70리 혹은 50~ 60리쯤 되는 작은 나라를 제가 다스릴 경우 3년이 지나면 백성들을 풍족하게 할 수 있으나 그 예악에 있어서는 군자를 기다리겠습니다.”
“적(赤)아,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공서화가 대답했다.
“제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를 원합니다. 종묘의 일이나 제후들이 회동할 때 현단복(玄端服)과 장보관(章甫冠)을 갖추어 집례를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점(點)아,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비파 타는 소리가 희미하게 가늘어지더니 쨍그랑 소리와 함께 증석이 비파를 놓고 일어나서 대답했다.
“세 사람이 늘어놓은 것과는 다릅니다.”
공자가 말했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실로 각자 그 뜻을 말하는 것이다.”
증석이 말했다.
“늦봄에 봄옷이 이루어지면 청년 대여섯 명과 동자 예닐곱 명과 함께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 쐬고서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
공자는 “아!” 하고 감탄하며 “나는 증석을 허여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세 사람이 밖으로 나가자 증석은 맨 뒤에 남아 공자에게 물었다.
“저 세 사람의 말이 어떻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실로 각자 자기 뜻을 말했을 뿐이다.”
증석이 물었다.
“그런데 왜 선생님께서는 자로를 비웃으셨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예로써 해야 하는데, 그 말이 겸손하지 않기에 웃었다.”
증석이 말했다.
“저 염유가 말한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아닙니까?”
공자가 말했다.
“사방 60~70리나 50~60리이면서 나라 다스리는 것이 아닌 것을 어디에서 보겠느냐?”
증석이 말했다.
“저 공서화가 말한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까?”
공자가 말했다.
“종묘의 일과 다른 나라 사신과 회동하는 일이 제후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공서화가 소(小)가 된다면 누가 능히 대(大)가 되겠느냐?”〉
이에 대해 어세겸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제자(弟子)들이 공자님을 조용히 모셨는데,
행단(杏壇)의 봄빛이 꽃가지에 사무쳤네.
태산(太山)이 멀리 서 있으니 우러를 만하구나.
기수(沂水)에 바람이 이니 노래하여 돌아오네.
비파 줄 위의 천지조화가 손을 따라 움직이니,
개중(個中)에 그 마음을 누구가 알랴?
자연과 함께하는 이치를 찾고자 하려거든,
반드시 크게 한바탕 퉁기고 비파를 놓던 때를 기억하시오.
성종의 신임을 얻어 탄탄대로를 걷다
성종 11년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어세겸은 이후 전라도 관찰사, 공조판서, 형조판서, 한성판윤, 호조판서, 병조판서를 두루 거쳤다. 명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의 일화 하나가 지금도 전한다.
〈공이 요동(遼東)에 도착하자 (명나라 관리인) 태감(太監) 및 총병관(摠兵官)·도어사(都御史) 등이 공을 위해 연회석을 마련했는데 공이 읍(揖)만 하고 무릎을 꿇지 않자 어사가 “왜 무릎을 꿇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라고 하자 공이 대답하기를 “나는 우리 전하(殿下)의 명(命)으로 경사(京師)에 내조(來朝)하는 중인데 대인(大人)들이 특별히 이 자리를 베풀어서 나를 예(禮)로써 위로했을 뿐이거늘 내 어찌 무릎을 꿇고서 술을 마셔야 한다는 말이오?”라고 하였다.〉
사실 이때는 명나라 사신의 파워가 하도 커서 한명회(韓明澮)조차 명나라 사신에 기대어 자신의 권력을 키워갔다는 점에서 어세겸의 이 같은 대응은 분명 남다른 것이었고 그것이 전해지자 조정에서도 칭송이 잇따랐다.
성종 13년(1482년) 8월 13일 어세겸은 다시 대사헌에 제수되었다. 같은 날 동생 어세공은 형조판서에 제수되었다. 이에 어세겸은 다시 형제가 나란히 형조와 대사헌을 맡을 수 없다며 사직을 청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종의 대답이 달랐다.
“부득이 갈아야 한다면 형조판서를 마땅히 갈아야 할 것이다. 경은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라.”
대사헌을 마치고 한직(閑職)에 머물며 대명(對明) 외교 업무를 담당하던 어세겸은 성종 14년(1483년) 8월 27일 형조판서에 오른다. 같은 날 김종직(金宗直)은 홍문관 부제학에 제수되었다. 형조판서였지만 성종은 명나라나 북방 여진 대책 등을 논할 때는 반드시 어세겸을 참여시켜 의견을 물었다. 성종 16년(1485년) 윤 4월 27일 어세겸은 경기관찰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듬해에는 한성부 판윤으로 옮긴다. 성종 18년(1487년) 6월 호조판서에 되었다가 9월에 병조판서에 제수된다. 말과 행실에 잘못이 없어 어세겸은 벼슬살이를 하는 동안 유배형을 받은 일이 없었다. 성종 21년(1490년) 4월 4일 어세겸은 종1품 한성부 판윤이 되었다. 종1품이란 이미 재상을 향해 가는 길목이었다. 같은 해 11월 어세겸은 의정부 우찬성이 되고 얼마 후 좌찬성으로 옮긴다.
文衡 어세겸
문형(文衡)이란 국가 문서를 짓는 최고 책임자를 말한다. 조선에서는 역대로 권근(權近), 윤회(尹淮), 변계량(卞季良), 최항이 맡아왔고 그 뒤를 어세겸이 잇고 있었다. 흔히 홍문관 대제학(大提學)이 이 일을 맡았는데 이 무렵 문형은 어세겸이 맡고 있었다.
그런데 성종 23년 어세겸이 모친상을 당해 문형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해 3월 19일 이 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두고서 조정에서 토론이 벌어졌다. 새로운 사람을 천거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어세겸이 삼년상을 마칠 때까지는 임시변통으로 하다가 다시 어세겸에게 문형을 맡기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었다. 굳이 교체한다면 우의정 노사신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그만큼 어세겸의 문장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성종은 결국 홍귀달(洪貴達)을 승진시켜 문형을 담당하게 하라고 명한다. 이에 대해서는 사신의 평이 실려 있다.
〈대제학은 문형을 담당하는 자이다. 노공필(盧公弼)은 문사(文詞)에 부족(不足)하였으나 직위가 상당하다고 하여 제수하니, 사람들이 모두 만족하게 여기지 않았었다. 이때에 와서 체임(遞任)시키고 홍귀달을 제수하였는데, 홍귀달은 젊어서부터 저술(著述)에 마음을 두어 시문(詩文)이 뛰어났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잘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탐욕스럽고 청렴하지 못하였으니, 재주는 넉넉하나 덕(德)이 모자라는 자이다.〉
성종 25년(1494년) 상을 마친 어세겸은 홍문관 대제학을 겸직하며 문형에 복귀한다.
그는 1483년 서거정(徐居正), 노사신과 함께 《연주시격(聯珠詩格)》과 《황산곡시집(黃山谷詩集)》을 한글로 번역했고 1490년 임원준(任元濬) 등과 함께 〈쌍화점(雙花店)〉 〈이상곡(履霜曲)〉 등의 악사(樂詞)를 개찬(改撰)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후 성종이 세상을 떠나면서 어세겸에게도 시련이 닥치기 시작한다.
연산군 때에 정승이 되다
연산 1년(1495년) 10월 14일 조정에서는 새로운 정승 후보를 두고서 연산군과 기존 정승들이 토의를 하고 있었다. 윤필상 등은 모두 어세겸의 이름을 적어 냈는데 연산군은 홍귀달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내보였다. 그러나 이틀 후 발표에서 연산군은 어세겸을 우의정에 제수했다. 그러고 이듬해인 연산 2년 2월 4일 어세겸은 좌의정, 정문형(鄭文炯)은 우의정에 제수된다. 정문형은 정도전(鄭道傳)의 증손자이다.
좌의정 어세겸은 전임 노사신의 길을 따라 걸을 뿐이었다. 연산군과 대간(臺諫) 사이에 끼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수시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그때마다 연산은 반려했다.
어세겸은 좌의정으로 있으면서 임금에 대한 직언을 꺼리지 않았다. 연산군 2년 봄에 좌의정이 된 그는 가을에 경연(經筵)에서 이렇게 말한다.
“한당(漢唐) 시대는 환관(宦官)들이 권력을 제멋대로 했는데 인주(人主·임금)는 이를 깨닫지 못하여 끝내 난망(亂亡)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대저 불은 염염(焰焰·불꽃이 활활 이는 모양)할 때 끄기 쉽고 물은 연연(涓涓·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모양)할 때 막기 쉽습니다.”
연산군의 미래상을 예감한 때문이었을까? 또 이듬해 경연에서는 후한(後漢)의 명제(明帝)에 관한 대목을 진강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임금은 성의정심(誠意正心)으로 학문을 닦은 연후에야 능히 이단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명제의 학문은 장구(章句)일 뿐이며 대도(大道)를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교에 현혹되어 만세(萬世) 화근의 기본을 만든 임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종께서는 불교를 엄히 배척(排斥)하여 도승(度僧)을 폐지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릉(宣陵·성종의 능) 곁에 절을 짓는 것은 비록 대비의 명이라 할지라도 전하께서 대의(大義)를 들어 못 하도록 청함이 마땅합니다. 내수사(內需司)의 비축은 모두 나라 물건이 아닌 것이 없는데, 이를 사찰(寺刹)의 창건에 쓰고 나라에서 빼낸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어찌 옳겠습니까?”
어세겸은 결국 사초(史草) 사건으로 대간의 공격을 받아 좌의정에서 물러났다. 실은 연산군이 직언을 꺼리지 않는 세겸을 물리친 측면도 있었다.
무오사화
그러는 사이에 1498년 음력 7월 무오사화(戊午史禍)가 발생했다. 여기에 실록 총재관 어세겸도 말려들었다.
즉 이극돈이 사료를 살피다가 김일손(金馹孫)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을 역사에 담으려 하는 것을 발견했다. 또 세조의 일을 비방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조의제문(弔義帝文)’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이극돈은 어세겸을 찾아가 말했다.
“일손이 선왕을 무훼(誣毁)하였는데, 신하가 이러한 일을 보고 상께 주달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나는 그 사초를 봉하여 아뢰어서 상의 처분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후환(後患)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어세겸은 깜짝 놀라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에 이극돈은 유자광을 찾아갔고 무오사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어세겸은 좌의정에서 물러났다. 그러고 2년 후 세상을 떠났다.
실록 졸기(卒記)는 그의 평소 성품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천품이 확실(確實)하고 기개와 도량이 크고 넓어 첩(妾)을 두지 않았고 용모를 가식하지 않았으며, 청탁을 하는 일이 없고 소소한 은혜를 베풀지도 않았다. 천성이 또한 청렴하고 검소하여 거처하는 집이 흙을 쌓아 층계를 만들고 벽은 흙만 바를 뿐 붉은 칠은 하지 않았다. 경사(經史) 읽기를 즐기고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손님이 오면 바로 면접하여 종일토록 마시었다. 문장을 만들어도 말이 되기만 힘쓰고 연마(硏磨)는 일삼지 않았으나 자기 일가(一家)를 이루었으며, 평생동안 사벽(邪辟)하고 허탄(虛誕)한 말에 미혹(迷惑)되지 아니하여 음양풍수설(陰陽風水說) 같은 것에도 확연(確然)하여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젊을 때부터 나아가 벼슬하는 일에는 욕심이 없어 요행으로 이득 보거나 벼슬하는 것과 같은 말은 입 밖에 내지를 않았고, 활쏘기와 말타기 하는 재주가 있었지만 일찍이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으며, 일찍이 편지 한 장 하여 자제(子弟)들을 위해 은택(恩澤)을 구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졸(卒)한 후 보니 집안에 남은 곡식이 없었는데, 세상 평판이 추앙하고 존중하여 재상(宰相)감이라고 하였다.〉
어세겸은 할아버지 어변갑이 집현전 직제학을 지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통 유학을 공부하고 인격적 수련 또한 겸비한 인물이다. 어쩌면 조선 왕조가 길러내려 했던 전형적인 관리였는지 모른다.
더불어 그의 독특한 업무 스타일과 관련해 흥미로운 일화가 또 하나 있다. 한성판윤으로 있을 때는 출퇴근 시각에 개의하지 않아 ‘오고당상(午鼓堂上)’이라 불렸다. 정오 북소리가 나서야 등청한다는 비유다. 그러나 정치를 능률적으로 하여 결송(決訟·소송의 결정)이 지체되지 않았다 한다.
갑자사화 때 부관참시를 당하다
연산군 10년 연산군은 어머니 윤씨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끔찍한 보복을 단행했다. 실록을 샅샅이 뒤져 정창손(鄭昌孫)·어세겸·심회(沈澮) 등을 부관참시(剖棺斬屍)했다. 부관참시보다 더한 형벌은 쇄골표풍(碎骨飄風)이었다. 연산은 ‘갑자육간(甲子六奸)’을 지목했는데 좌의정 이극균(李克均), 예조판서 이세좌(李世佐), 영의정을 지낸 윤필상(尹弼商), 성준(成俊), 한치형(韓致亨)과 더불어 어세겸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또 연산군은 어세겸 증손까지 나누어 귀양을 보내도록 명했다. 광기(狂氣)의 임금을 만나 일평생 지켰던 지조와 도리가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 동생 어세공은 형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 연산군의 폭정을 피할 수 있었다.
이 일로 어세겸의 집안은 족멸에 이르렀지만 어씨의 가세는 어세공으로 이어진다. 먼 훗날 경종(景宗)의 계비 선의왕후 어씨(魚氏)가 바로 어세공 후손이다. 선의왕후 묘지문에 그 세계가 잘 정리되어 있다.
〈후(后)의 성은 어씨(魚氏)로 세계(世系)는 함종(咸從)이다. 원조(遠祖)는 화인(化仁)인데 여조(麗朝)에 비로소 드러났으며, 국초(國初)에는 직제학(直提學) 어변갑이 염퇴(恬退)한 절개가 있었고, 판중추(判中樞) 어효첨과 호조판서 양숙공(襄肅公) 어세공에게 전해 와서는 이들 부자(父子)가 훈덕(勳德)으로써 3세(三世)에 현양(顯揚)되었으며, 좌참찬(左參贊) 어계선(魚季瑄)은 또 명종(明宗)·선조(宣祖) 때에 현달(顯達)하였다. 고조(高祖) 어한명(魚漢明)은 수운판관(水運判官)으로 증(贈) 좌찬성(左贊成)이고, 증조(曾祖) 어진익(魚震翼)은 강원도 관찰사로서 증(贈) 좌찬성(左贊成)이며, 조부(祖父) 어사형(魚史衡)은 한성우윤(漢城右尹)으로서 증(贈) 영의정(領議政)인데, 이분이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함원부원군(咸原府院君) 어유귀(魚有龜)를 낳았다. 어유귀는 해미현감(海美縣監) 이하번(李夏蕃)의 따님에게 장가갔는데, 중종대왕(中宗大王)의 6세손(六世孫)으로서 완릉부부인(完陵府夫人)에 추봉(追封)되었다. 후께서는 어려서부터 단중(端重)하여 함부로 유희(遊戲)하지 않았으며, 행동거지가 저절로 법도에 맞았다. 말수가 적고 기쁨과 성냄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으며 늘 해어진 옷을 입고 남의 화식(華飾)을 보아도 부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으며, 성품이 효순(孝順)하였다.〉
이처럼 좌의정에 오른 어세겸은 오히려 그 후손이 쇠미한 반면 일찍 죽어 연산을 피한 어세공 후손은 크게 현달했으니, 명(命)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엿볼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외천명(畏天命)하라고 했는지 모른다.
어세겸은 노사신과 더불어 명재상감으로 지목되었으나 연산군을 만나는 바람에 패가망신하고 말았다.⊙
어세겸의 아버지 어효첨(魚孝瞻·1405~1475년)은 아버지 어변갑의 학문과 곧은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했던 어효첨은 세종 11년(1429년) 문과에 급제해 얼마 후부터 아버지 어변갑과 마찬가지로 집현전에서 경력을 쌓았다. 세종·문종 등이 모두 그의 학문을 극찬했고 세조 때 이조·호조·형조·공조참판과 대사헌을 역임했다. 이 당시 세조는 신하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어효첨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모두 실록에 기록된 일화다.
“이 사람은 내가 경중(敬重)하는 바이며 일찍이 세종에게 천거된 자이다.”
또 정2품 자헌대부로 승급시키면서 이렇게 말했다.
“경은 정직한 사람이다. 대신 중에 경의 아들 어세겸을 천거하는 자가 있으니 내가 집안 뜰의 가르침[家庭之訓]이 있음을 안다.”
과정지훈(過庭之訓)
세조가 말한 가정지훈(家庭之訓)은 아버지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인데 《논어》 계씨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일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강(陳亢)이 (공자 아들) 백어(伯魚)에게 물었다.
“그대는 특별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
(백어가) 대답했다.
“(그런 특별한 것은) 들은 적이 없다. 일찍이 홀로 서 계실 때 내가 종종걸음으로 뜰을 지나가는데[過庭] ‘시(詩)를 배웠느냐?’라고 물으시기에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고 했더니 ‘시를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시므로 내가 물러나와 시를 배웠다. 다른 날에 또 홀로 서 계실 때 종종걸음으로 뜰을 지나가는데 ‘예(禮)를 배웠느냐?’고 물으시기에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니 ‘예를 배우지 않으면 설 수 없다’고 하셨다. 나는 물러나와 예를 배웠다. 이 두 가지를 들었을 뿐이다.”
이에 진강이 물러나 기뻐하며 말했다.
“하나를 물어 세 가지를 얻었으니 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듣고 예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듣고 또 군자가 그 아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遠=公]을 들었구나!”〉
맹모삼천(孟母三遷)이 어머니로부터 받는 교훈임과 마찬가지로 과정지훈(過庭之訓)은 아버지로부터 받는 교훈이다. 세조가 말한 가정지훈(家庭之訓)은 바로 뜰을 지날 때 받는 아버지로부터의 가르침인 과정지훈(過庭之訓)과 같다.
어효첨은 세조 때 이조판서를 지냈으나 그 후 주로 중추원 지사, 판사, 영사를 지내면서 현실 정치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태종 때 좌의정 박은(朴訔)이 그의 장인이며 아들은 어세겸과 어세공(魚世恭·1432~1486년)을 두었다. 어효첨에 이르러 명문가로 자리 잡은 것이다.
순탄한 벼슬 생활
세조 2년(1456년) 동생 세공과 함께 문과에 급제한 어세겸은 순조롭게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가 승문원(承文院) 정자(正字)로 있던 세조 4년 5월 22일 세조는 어세겸 등을 불러 이렇게 말한다.
“국가에서 지금 너희를 선임한 것은 한훈(漢訓) 이문(吏文)을 정통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각각 그 업에 최선을 다하라.”
즉 중국어와 더불어 관리용 문자 이문에 일가견이 있었다. 이후 이듬해인 세조 5년 천추사(千秋使) 이극배(李克培)의 수행관원인 이문학관(吏文學官)이 되어 명(明)나라를 다녀온다. 학술과 문장에도 능했던 어세겸은 동생 세공과 함께 세조의 명을 받아 편찬한 《주역구결(周易口訣)》과 권근(權近)의 구결을 비교 토의하는 모임에도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문명(文名)을 얻게 된 어세겸은 예문관 대교(待敎), 봉상시 직장(直長), 성균관 주부(主簿), 예문관 봉교(奉敎) 등을 거치는데 모두 임금이 직무상 필요로 하는 글을 짓는 요직이었다. 이어 어세겸은 이조정랑을 거쳐 세조 13년(1467년) 8월 우부승지에 제수되고 이어 우승지에 이른다. 권부(權府) 핵심에 이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대 실력자 김국광(金國光)이나 한계희(韓繼禧) 등의 천거를 받기도 했다.
이런 어세겸에게도 살짝 위기가 찾아온다. 세조 14년 5월 1일 세조가 서현정(序賢亭)에 나아가 조정 신료와 종친들을 불러 활쏘기를 한 다음 술자리를 베풀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공조판서 남이(南怡)가 술에 취해 실언(失言)을 했다.
“상(上)께서는 구성군(龜城君) 이준(李浚)을 지나치게 사랑하시니 신은 남몰래 그것이 잘못이라고 여깁니다.”
이준은 세종 4남 임영대군의 아들이다. 세조의 조카다. 이시애의 난을 토평(討平)한 공로로 20대 때 영의정에 오를 정도로 세조의 총애를 받았다. 이미 이때 남이의 난이 예고된 셈이다.
화가 난 세조는 당장 남이를 옥에 가두었다. 그러고 여러 신하에게 “남이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 물었는데 모두 남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어세겸은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세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어세겸을 쓸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승지가 된 이후부터는 그 옳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어세겸은 기밀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 세조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다.
형보다 앞서간 동생 어세공
예종 1년(1469년) 남이 역모 사건이 일어났고 어세겸은 이를 다스리는 데 참여한 공로로 익대공신(翊戴功臣) 3등에 책록되고 함종군(咸從君)에 봉해졌다.
그런데 형 어세겸이 정3품 승지에 있을 때 동생 어세공은 이미 세조 말 정2품 병조판서에 오른다. 세조 13년(1467년) 이시애의 난이 일어나자 함길도 관찰사에 중용되어 난을 평정한 공으로 적개공신(敵愾功臣) 2등에 책록됐기 때문이다. 이후 아성군(牙城君) 어세공은 성종 때 공조·병조·형조·호조판서를 두루 지내고 재상에 이르는 계단이라 할 수 있는 의정부 우참찬에 이르렀는데 형보다 먼저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재상에 이르지는 못했다. 실록이 전하는 그의 졸기(卒記)다.
〈어세공은 영민(英敏)하여 복잡한 일을 잘 처리하였고, 무격(巫覡·미신)·부도(浮屠·불교)·지리(地理·풍수)의 구기(拘忌)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으며, 늘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 것을 일삼았으므로 남들이 그 효성에 감탄하였다. 다만 심정원(沈貞源)이 버린 아내에게 재산이 매우 많았는데, 이를 후처(後妻)로 삼았으므로 남들이 비루하게 여겨 비웃었다.〉
심정원은 세종의 장인 심온(沈溫)의 손자이자 소헌왕후의 동생 심결(沈決·1419~1470년)의 아들이다. 실록에 따르면 세조 9년(1463년) 정인지의 아들 공조정랑 정숭조(鄭崇祖)와 심결의 아들인 세자참군 심정원이 까닭 없이 아내를 버렸다 하여 조정으로부터 견책을 받은 일이 있었다.
성종 초 어세겸은 함종군 자격으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일을 주로 맡았다. 성종 1년(1470년) 5월 26일 어세겸은 홍제원에서 명나라 사신단을 송별하고 돌아와 이렇게 아뢴다.
“중국 부사가 말하기를 ‘전하의 춘추가 열넷이라고 하는데 말과 행동이 실수가 없고 또 총명형철(聰明瑩澈)하니 참으로 조선의 성군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성종 2년(1471년) 10월 23일 어세겸은 예조참판에 제수된다. 성종 3년, 성종이 인정전에 나아가 선비들에게 시험문제를 내는데 이때 독권관(讀券官)이 좌의정 최항(崔恒), 좌찬성 노사신(盧思愼), 그리고 예조참판 어세겸이었다.
성종 9년(1478년) 어세겸은 부총관에 제수된다. 그러나 동생 어세공이 병조판서였기에 형제가 함께 병권(兵權)을 쥐어서는 안 된다며 부총관 제수는 취소된다. 상피법(相避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다시 함종군 자격에 머물렀다. 하나 어세겸은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 10년(1479년) 2월 10일 도승지 홍귀달(洪貴達)이 성종에게 아뢰었다.
“이극돈(李克墩), 어세겸은 큰일을 맡길 만한데 지금 한산한 곳에 두었으니 신은 뛰어난 이를 등용하는 것이 지극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이에 성종은 “내가 마땅히 쓸 것이다”라고 답했다. 홍귀달은 당대 명신이었다. 실제로 3개월 후인 5월 11일 어세겸은 사헌부 대사헌에 제수된다. 그러나 다음 날 어세겸은 성종을 찾아가 아뢰었다.
“신의 아우 어세공이 지금 병조판서로 있습니다. 사헌부와 병조는 서로 분경(奔競)을 살피고 또 인사의 잘못을 탄핵하는 자리이니 신의 직책을 갈아주소서.”
이리하여 같은 날 한성부 좌윤으로 자리를 옮긴다. 일에는 민첩하고 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공자의 민어사(敏於事) 신어언(愼於言) 가르침을 실천하는 인물이었다. 같은 해 8월 1일 어세겸은 핵심 요직인 이조참판에 제수된다. 와중에도 그는 국가 현안이 있으면 북경으로 가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 돌아왔다. 이 무렵 태평을 누리는 임금과 신하의 훈훈한 장면 하나가 실록에 실려 있다.
《논어》 증점고슬도(曾點鼓瑟圖)에 대한 시를 짓다
성종 11년 10월 14일 성종은 병풍 12폭을 내어 문신 중에서 시에 능한 12명을 뽑아 각각 칠언율시 1편씩을 지어 올리게 했다. 어세겸은 《논어》에 나오는 증점고슬도(曾點鼓瑟圖)에 대한 시를 지어 올렸다. 증점이 비파를 켜는 장면은 선진(先進)편에 나온다.
〈자로(子路), 증석(曾晳), 염유(冉有), 공서화(公西華)가 공자를 모시고 앉아 있었다. 공자가 말했다.
“내가 너희보다 나이가 조금 많다고 하여 나에게 말하는 것을 어려워 마라. 평소에 너희는 말하기를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혹시 사람들이 너희를 알아준다면 어찌하겠느냐?”
자로가 경솔하게 나서 대답했다.
“전차 천 대를 가진 제후의 나라가 대국들 사이에 끼여 군사적 침략이 가해지고 그로 인하여 기근이 들게 되거든 제가 그 나라를 다스릴 경우 3년이 지나면 백성들을 용맹하게 하고 또 의리를 향해 나아가는 법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구(求)야,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염유가 대답했다.
“사방 넓이 60~70리 혹은 50~ 60리쯤 되는 작은 나라를 제가 다스릴 경우 3년이 지나면 백성들을 풍족하게 할 수 있으나 그 예악에 있어서는 군자를 기다리겠습니다.”
“적(赤)아,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공서화가 대답했다.
“제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를 원합니다. 종묘의 일이나 제후들이 회동할 때 현단복(玄端服)과 장보관(章甫冠)을 갖추어 집례를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점(點)아,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비파 타는 소리가 희미하게 가늘어지더니 쨍그랑 소리와 함께 증석이 비파를 놓고 일어나서 대답했다.
“세 사람이 늘어놓은 것과는 다릅니다.”
공자가 말했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실로 각자 그 뜻을 말하는 것이다.”
증석이 말했다.
“늦봄에 봄옷이 이루어지면 청년 대여섯 명과 동자 예닐곱 명과 함께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 쐬고서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
공자는 “아!” 하고 감탄하며 “나는 증석을 허여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세 사람이 밖으로 나가자 증석은 맨 뒤에 남아 공자에게 물었다.
“저 세 사람의 말이 어떻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실로 각자 자기 뜻을 말했을 뿐이다.”
증석이 물었다.
“그런데 왜 선생님께서는 자로를 비웃으셨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예로써 해야 하는데, 그 말이 겸손하지 않기에 웃었다.”
증석이 말했다.
“저 염유가 말한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아닙니까?”
공자가 말했다.
“사방 60~70리나 50~60리이면서 나라 다스리는 것이 아닌 것을 어디에서 보겠느냐?”
증석이 말했다.
“저 공서화가 말한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까?”
공자가 말했다.
“종묘의 일과 다른 나라 사신과 회동하는 일이 제후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공서화가 소(小)가 된다면 누가 능히 대(大)가 되겠느냐?”〉
이에 대해 어세겸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제자(弟子)들이 공자님을 조용히 모셨는데,
행단(杏壇)의 봄빛이 꽃가지에 사무쳤네.
태산(太山)이 멀리 서 있으니 우러를 만하구나.
기수(沂水)에 바람이 이니 노래하여 돌아오네.
비파 줄 위의 천지조화가 손을 따라 움직이니,
개중(個中)에 그 마음을 누구가 알랴?
자연과 함께하는 이치를 찾고자 하려거든,
반드시 크게 한바탕 퉁기고 비파를 놓던 때를 기억하시오.
성종의 신임을 얻어 탄탄대로를 걷다
성종 11년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어세겸은 이후 전라도 관찰사, 공조판서, 형조판서, 한성판윤, 호조판서, 병조판서를 두루 거쳤다. 명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의 일화 하나가 지금도 전한다.
〈공이 요동(遼東)에 도착하자 (명나라 관리인) 태감(太監) 및 총병관(摠兵官)·도어사(都御史) 등이 공을 위해 연회석을 마련했는데 공이 읍(揖)만 하고 무릎을 꿇지 않자 어사가 “왜 무릎을 꿇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라고 하자 공이 대답하기를 “나는 우리 전하(殿下)의 명(命)으로 경사(京師)에 내조(來朝)하는 중인데 대인(大人)들이 특별히 이 자리를 베풀어서 나를 예(禮)로써 위로했을 뿐이거늘 내 어찌 무릎을 꿇고서 술을 마셔야 한다는 말이오?”라고 하였다.〉
사실 이때는 명나라 사신의 파워가 하도 커서 한명회(韓明澮)조차 명나라 사신에 기대어 자신의 권력을 키워갔다는 점에서 어세겸의 이 같은 대응은 분명 남다른 것이었고 그것이 전해지자 조정에서도 칭송이 잇따랐다.
성종 13년(1482년) 8월 13일 어세겸은 다시 대사헌에 제수되었다. 같은 날 동생 어세공은 형조판서에 제수되었다. 이에 어세겸은 다시 형제가 나란히 형조와 대사헌을 맡을 수 없다며 사직을 청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종의 대답이 달랐다.
“부득이 갈아야 한다면 형조판서를 마땅히 갈아야 할 것이다. 경은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라.”
대사헌을 마치고 한직(閑職)에 머물며 대명(對明) 외교 업무를 담당하던 어세겸은 성종 14년(1483년) 8월 27일 형조판서에 오른다. 같은 날 김종직(金宗直)은 홍문관 부제학에 제수되었다. 형조판서였지만 성종은 명나라나 북방 여진 대책 등을 논할 때는 반드시 어세겸을 참여시켜 의견을 물었다. 성종 16년(1485년) 윤 4월 27일 어세겸은 경기관찰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듬해에는 한성부 판윤으로 옮긴다. 성종 18년(1487년) 6월 호조판서에 되었다가 9월에 병조판서에 제수된다. 말과 행실에 잘못이 없어 어세겸은 벼슬살이를 하는 동안 유배형을 받은 일이 없었다. 성종 21년(1490년) 4월 4일 어세겸은 종1품 한성부 판윤이 되었다. 종1품이란 이미 재상을 향해 가는 길목이었다. 같은 해 11월 어세겸은 의정부 우찬성이 되고 얼마 후 좌찬성으로 옮긴다.
文衡 어세겸
문형(文衡)이란 국가 문서를 짓는 최고 책임자를 말한다. 조선에서는 역대로 권근(權近), 윤회(尹淮), 변계량(卞季良), 최항이 맡아왔고 그 뒤를 어세겸이 잇고 있었다. 흔히 홍문관 대제학(大提學)이 이 일을 맡았는데 이 무렵 문형은 어세겸이 맡고 있었다.
그런데 성종 23년 어세겸이 모친상을 당해 문형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해 3월 19일 이 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두고서 조정에서 토론이 벌어졌다. 새로운 사람을 천거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어세겸이 삼년상을 마칠 때까지는 임시변통으로 하다가 다시 어세겸에게 문형을 맡기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었다. 굳이 교체한다면 우의정 노사신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그만큼 어세겸의 문장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성종은 결국 홍귀달(洪貴達)을 승진시켜 문형을 담당하게 하라고 명한다. 이에 대해서는 사신의 평이 실려 있다.
〈대제학은 문형을 담당하는 자이다. 노공필(盧公弼)은 문사(文詞)에 부족(不足)하였으나 직위가 상당하다고 하여 제수하니, 사람들이 모두 만족하게 여기지 않았었다. 이때에 와서 체임(遞任)시키고 홍귀달을 제수하였는데, 홍귀달은 젊어서부터 저술(著述)에 마음을 두어 시문(詩文)이 뛰어났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잘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탐욕스럽고 청렴하지 못하였으니, 재주는 넉넉하나 덕(德)이 모자라는 자이다.〉
성종 25년(1494년) 상을 마친 어세겸은 홍문관 대제학을 겸직하며 문형에 복귀한다.
그는 1483년 서거정(徐居正), 노사신과 함께 《연주시격(聯珠詩格)》과 《황산곡시집(黃山谷詩集)》을 한글로 번역했고 1490년 임원준(任元濬) 등과 함께 〈쌍화점(雙花店)〉 〈이상곡(履霜曲)〉 등의 악사(樂詞)를 개찬(改撰)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후 성종이 세상을 떠나면서 어세겸에게도 시련이 닥치기 시작한다.
연산군 때에 정승이 되다
연산 1년(1495년) 10월 14일 조정에서는 새로운 정승 후보를 두고서 연산군과 기존 정승들이 토의를 하고 있었다. 윤필상 등은 모두 어세겸의 이름을 적어 냈는데 연산군은 홍귀달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내보였다. 그러나 이틀 후 발표에서 연산군은 어세겸을 우의정에 제수했다. 그러고 이듬해인 연산 2년 2월 4일 어세겸은 좌의정, 정문형(鄭文炯)은 우의정에 제수된다. 정문형은 정도전(鄭道傳)의 증손자이다.
좌의정 어세겸은 전임 노사신의 길을 따라 걸을 뿐이었다. 연산군과 대간(臺諫) 사이에 끼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수시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그때마다 연산은 반려했다.
어세겸은 좌의정으로 있으면서 임금에 대한 직언을 꺼리지 않았다. 연산군 2년 봄에 좌의정이 된 그는 가을에 경연(經筵)에서 이렇게 말한다.
“한당(漢唐) 시대는 환관(宦官)들이 권력을 제멋대로 했는데 인주(人主·임금)는 이를 깨닫지 못하여 끝내 난망(亂亡)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대저 불은 염염(焰焰·불꽃이 활활 이는 모양)할 때 끄기 쉽고 물은 연연(涓涓·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모양)할 때 막기 쉽습니다.”
연산군의 미래상을 예감한 때문이었을까? 또 이듬해 경연에서는 후한(後漢)의 명제(明帝)에 관한 대목을 진강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임금은 성의정심(誠意正心)으로 학문을 닦은 연후에야 능히 이단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명제의 학문은 장구(章句)일 뿐이며 대도(大道)를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교에 현혹되어 만세(萬世) 화근의 기본을 만든 임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종께서는 불교를 엄히 배척(排斥)하여 도승(度僧)을 폐지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릉(宣陵·성종의 능) 곁에 절을 짓는 것은 비록 대비의 명이라 할지라도 전하께서 대의(大義)를 들어 못 하도록 청함이 마땅합니다. 내수사(內需司)의 비축은 모두 나라 물건이 아닌 것이 없는데, 이를 사찰(寺刹)의 창건에 쓰고 나라에서 빼낸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어찌 옳겠습니까?”
어세겸은 결국 사초(史草) 사건으로 대간의 공격을 받아 좌의정에서 물러났다. 실은 연산군이 직언을 꺼리지 않는 세겸을 물리친 측면도 있었다.
무오사화
그러는 사이에 1498년 음력 7월 무오사화(戊午史禍)가 발생했다. 여기에 실록 총재관 어세겸도 말려들었다.
즉 이극돈이 사료를 살피다가 김일손(金馹孫)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을 역사에 담으려 하는 것을 발견했다. 또 세조의 일을 비방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조의제문(弔義帝文)’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이극돈은 어세겸을 찾아가 말했다.
“일손이 선왕을 무훼(誣毁)하였는데, 신하가 이러한 일을 보고 상께 주달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나는 그 사초를 봉하여 아뢰어서 상의 처분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후환(後患)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어세겸은 깜짝 놀라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에 이극돈은 유자광을 찾아갔고 무오사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어세겸은 좌의정에서 물러났다. 그러고 2년 후 세상을 떠났다.
실록 졸기(卒記)는 그의 평소 성품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천품이 확실(確實)하고 기개와 도량이 크고 넓어 첩(妾)을 두지 않았고 용모를 가식하지 않았으며, 청탁을 하는 일이 없고 소소한 은혜를 베풀지도 않았다. 천성이 또한 청렴하고 검소하여 거처하는 집이 흙을 쌓아 층계를 만들고 벽은 흙만 바를 뿐 붉은 칠은 하지 않았다. 경사(經史) 읽기를 즐기고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손님이 오면 바로 면접하여 종일토록 마시었다. 문장을 만들어도 말이 되기만 힘쓰고 연마(硏磨)는 일삼지 않았으나 자기 일가(一家)를 이루었으며, 평생동안 사벽(邪辟)하고 허탄(虛誕)한 말에 미혹(迷惑)되지 아니하여 음양풍수설(陰陽風水說) 같은 것에도 확연(確然)하여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젊을 때부터 나아가 벼슬하는 일에는 욕심이 없어 요행으로 이득 보거나 벼슬하는 것과 같은 말은 입 밖에 내지를 않았고, 활쏘기와 말타기 하는 재주가 있었지만 일찍이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으며, 일찍이 편지 한 장 하여 자제(子弟)들을 위해 은택(恩澤)을 구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졸(卒)한 후 보니 집안에 남은 곡식이 없었는데, 세상 평판이 추앙하고 존중하여 재상(宰相)감이라고 하였다.〉
어세겸은 할아버지 어변갑이 집현전 직제학을 지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통 유학을 공부하고 인격적 수련 또한 겸비한 인물이다. 어쩌면 조선 왕조가 길러내려 했던 전형적인 관리였는지 모른다.
더불어 그의 독특한 업무 스타일과 관련해 흥미로운 일화가 또 하나 있다. 한성판윤으로 있을 때는 출퇴근 시각에 개의하지 않아 ‘오고당상(午鼓堂上)’이라 불렸다. 정오 북소리가 나서야 등청한다는 비유다. 그러나 정치를 능률적으로 하여 결송(決訟·소송의 결정)이 지체되지 않았다 한다.
갑자사화 때 부관참시를 당하다
연산군 10년 연산군은 어머니 윤씨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끔찍한 보복을 단행했다. 실록을 샅샅이 뒤져 정창손(鄭昌孫)·어세겸·심회(沈澮) 등을 부관참시(剖棺斬屍)했다. 부관참시보다 더한 형벌은 쇄골표풍(碎骨飄風)이었다. 연산은 ‘갑자육간(甲子六奸)’을 지목했는데 좌의정 이극균(李克均), 예조판서 이세좌(李世佐), 영의정을 지낸 윤필상(尹弼商), 성준(成俊), 한치형(韓致亨)과 더불어 어세겸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또 연산군은 어세겸 증손까지 나누어 귀양을 보내도록 명했다. 광기(狂氣)의 임금을 만나 일평생 지켰던 지조와 도리가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 동생 어세공은 형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 연산군의 폭정을 피할 수 있었다.
이 일로 어세겸의 집안은 족멸에 이르렀지만 어씨의 가세는 어세공으로 이어진다. 먼 훗날 경종(景宗)의 계비 선의왕후 어씨(魚氏)가 바로 어세공 후손이다. 선의왕후 묘지문에 그 세계가 잘 정리되어 있다.
〈후(后)의 성은 어씨(魚氏)로 세계(世系)는 함종(咸從)이다. 원조(遠祖)는 화인(化仁)인데 여조(麗朝)에 비로소 드러났으며, 국초(國初)에는 직제학(直提學) 어변갑이 염퇴(恬退)한 절개가 있었고, 판중추(判中樞) 어효첨과 호조판서 양숙공(襄肅公) 어세공에게 전해 와서는 이들 부자(父子)가 훈덕(勳德)으로써 3세(三世)에 현양(顯揚)되었으며, 좌참찬(左參贊) 어계선(魚季瑄)은 또 명종(明宗)·선조(宣祖) 때에 현달(顯達)하였다. 고조(高祖) 어한명(魚漢明)은 수운판관(水運判官)으로 증(贈) 좌찬성(左贊成)이고, 증조(曾祖) 어진익(魚震翼)은 강원도 관찰사로서 증(贈) 좌찬성(左贊成)이며, 조부(祖父) 어사형(魚史衡)은 한성우윤(漢城右尹)으로서 증(贈) 영의정(領議政)인데, 이분이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함원부원군(咸原府院君) 어유귀(魚有龜)를 낳았다. 어유귀는 해미현감(海美縣監) 이하번(李夏蕃)의 따님에게 장가갔는데, 중종대왕(中宗大王)의 6세손(六世孫)으로서 완릉부부인(完陵府夫人)에 추봉(追封)되었다. 후께서는 어려서부터 단중(端重)하여 함부로 유희(遊戲)하지 않았으며, 행동거지가 저절로 법도에 맞았다. 말수가 적고 기쁨과 성냄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으며 늘 해어진 옷을 입고 남의 화식(華飾)을 보아도 부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으며, 성품이 효순(孝順)하였다.〉
이처럼 좌의정에 오른 어세겸은 오히려 그 후손이 쇠미한 반면 일찍 죽어 연산을 피한 어세공 후손은 크게 현달했으니, 명(命)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엿볼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외천명(畏天命)하라고 했는지 모른다.
어세겸은 노사신과 더불어 명재상감으로 지목되었으나 연산군을 만나는 바람에 패가망신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