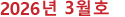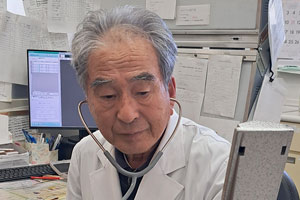⊙ ‘이다음 나는 풀잎의 뒤태, 저녁연기, 뛰어오르는 가물치 등으로 살겠다’(문성해)
⊙ ‘바위는 변하고 있어요 사막을 건너가는 낙타 발자국이 될 때까지’(김성민)
⊙ ‘바위는 변하고 있어요 사막을 건너가는 낙타 발자국이 될 때까지’(김성민)
김남조(金南祚) 시인의 시집 《사람아, 사람아》(문학수첩·2020)를 서점에서 샀다. 노(老)시인의 연륜이 시의 행간에 가득했다. 읽고 또 읽어도 정서의 촉감이 줄지 않았다. 평생 시를 써왔지만, 시인은 시집 첫머리에 이렇게 고백한다.
〈시는 어떤 맹렬한 질투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가령 시인이 어느 기간 다른 일에 몰입하였다가 되돌아오면 시는 철문을 닫고 오랫동안 열어 주지 않았으며 이럴 때 시인은 닫힌 문 앞에 힘겹게 서 있곤 합니다.
‘나는 시인 아니다. 시를 구걸하는 사람이다. 백기 들고 항복 항복이라며 굴복한 일이 여러 번이다’ ‘시여 한평생 나를 이기기만 하는 시여’라며 오늘에 이른 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만큼 시가, 문학이 어렵다. 마치 생이, 삶이 어렵듯이.
풍성히 은혜 주셨는데,
비어 있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솔숲의 솔잎만큼
기도말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받으셨는지요
저의 기도는
연필심처럼 허약하여
하늘 가는 중도에서 여러 번
부러졌을지 모릅니다.
그러한들 솔숲의 솔잎들이
하늘 아닌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저의 기도도
그처럼 단순합니다
-김남조의 ‘단순한 기도’ 전문
수많은 시집과 시 전집도 여러 차례 간행한, ‘산전수전 다 겪은’ 시인이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시는 점점 단순하고 단아하다. 마치 기도처럼 사유의 깊이는 더욱 무르익어 간다. ‘신(神)은 풍성히 은혜를 주셨는데 / 비어 있는 저를 용서해 달라’는 역설적 표현도 인상적이다.
글의 진정성은 무엇인가
묻고 더 생각한다
문학이여
내 한평생 길 가고 또 가고
출발 지점에
다시 와 있구나
-김남조의 ‘책을 읽으며’ 일부
평생 글과 함께 살며 글의 행간과 행간의 의미망 속에서 자신의 생을 견주어왔지만, 시를 쓴다는 것은 늘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일이다.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고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뒤돌아보고 생을 다시 활시위에 세운다.
‘손이 많이 가는 남자’와 ‘돗자리 파는 노점 영감의 뒤태’
박현구 시인이 작년 첫 시집 《손이 많이 가는 남자》(시문학·2020)를 펴냈다. 시 ‘손이 많이 가는 남자’는 중년 남자의 고백인데 화자(話者)는 아내다.
제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이 많이 가는 남자’는 물론 시인 자신이다. ‘그 남자의 접시 위에서 / 가시를 발라주는’ 아내의 손이 ‘꿀밭의 나비처럼 제 먼저 춤을 춘다’는 표현이 약간 어리둥절하지만, 아내를 은근히 치켜세우는 시인의 능청과 해학이 느껴진다.
여윈 남자가 있습니다.
제 손으로 아무것도 못 하는 그 남자는
냉장고의 음식도 찾아 먹지 못해
차라리 굶습니다.
마음 편히 외출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가족들을 먹여 살려 왔습니다
얼굴 검버섯을 빼며,
테이프를 갈아붙일 때도
보호 크림을 바를 때도
밉상스레 얼굴을 열흘 내내 갖다 댑니다.
시골의 동서가
시숙이 좋아한다며
살짝 말린 가자미를 보내왔어요
구운 걸 좋아하는 남자라
흥겨운 마음에 몇 마리를 구워내자
이번엔 알아서 먹어 보겠다고
돋보기를 챙기며 결기를 보이는
그 남자의 접시 위에서
가시를 발라주는 내 손이
꿀밭의 나비처럼 제 먼저 춤을 추네요
딸과 함께 웃으며 흉을 보던
참 ‘손이 많이 가는 남자’를
50년이나 공을 들여 내가 키웠나 봅니다
-박현구의 ‘손이 많이 가는 남자’ 전문
어쩌면 ‘손이 많이 가는 남자’는 우리 아버지의 자화상일지 모른다.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감정표현이 서툰 중년 남성이 많다. 표현이 미숙하니 화가 치밀어오르고 얼굴이 붉어지기 일쑤다. 그러나 속은 타들어 가고 얼마 후 후회와 실망에 몸서리친다.
시인의 아내는 그런 남편, ‘손이 많이 가는 남자’를 헌신적으로 이해해주니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언제까지 아내의 헌신에 기댈 수야 없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먼저 변해야 한다.
젊은 시인 문성해의 다섯 번째 시집 《내가 모르는 한 사람》(문학수첩·2020)도 흥미롭다. 생의 현상 이면의 것에 시인은 관심이 많다. 화려한 앞면보다 잘 안 보이는 뒤태에 눈길을 둔다. 반성적 사유를 통해 시인만이 할 수 있는 순간포착이다.
돗자리 파는 노점 영감님 뒤태가 꼭 김춘수 선생 같다
목이 기룸하고 어깨는 조붓하고 키는 중키인
뒤태에 예전에 돌아가신 선생 뒤태가 붙어 계신다
전봇대에 뭔가를 붙이는 사람 뒤에 돌아가신 삼촌이 있고
저수지에 앉아 있는 낚시꾼 뒤엔 큰아버지가 있다
마을 어귀 바위 위에도 어릴 때 잃어버린 백구의 등이 얹혀 있다.
이들은 다 한통속으로 앞을 보여 주지 않는다
봄날 오후의 언덕과
축사로 들어서는 염소들 등에도 얹혀 있는 것들
내 뒤에도 누가 붙어사는지
가다가 한참을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다.
나의 뒤에 내가 모르는 한 사람이 붙어사는 일
나는 그를 위해 밥을 주고 잠을 주고 노래를 준다
이다음 나는 풀잎의 뒤태로 살 것이다
돌아나가는 저녁연기와
강물 위로 뛰어오르는 가물치 등도 좋을 것이다
-문성해의 ‘뒤태’ 전문
가끔 길을 걷다가 누굴 닮은 뒤태를 발견하게 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부러 앞으로 다가가 슬쩍 뒤돌아본다. 물론 내가 알던 그 사람은 아니지만 ‘뒤태’는 많은 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힘이 있다. 시인은 또 다른 생을 산다면 ‘풀잎의 뒤태, 돌아나가는 저녁연기, 가물치 등’으로 살겠다고 다짐한다. 여리고 투명한 풀잎, 평화로운 저녁연기, 활력의 상징인 가물치의 뒤태를 포착한 시인의 사유가 말랑말랑하다.
변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천천히
김성민 시인의 동시집 《고향에 계신 낙타께》(창비·2021)를 서점에서 샀다. 시인이 기자에게 우편으로 보냈는데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동심을 좇는 시인의 상상력이 독자로 하여금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동시의 맛이 이런 것이구나, 탄복하게 만든다.
바위는 진화 중이에요
커다란 덩어리에서
쪼끄만 알갱이로
꿈쩍 않는 무거움에서
작은 바람에도 굴러가는 가벼움으로
바위는 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천천히
사막을 건너가는 낙타 발자국이 될 때까지
-김성민의 ‘사막이 될 시간’ 전문
바위가 사막의 모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아주,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짧은 동시 속에 그 세월을 압축할 수 있으니 시라는 장르가 얼마나 위대한가. 시인은 ‘모래’라는 표현 대신 ‘사막을 건너는 낙타 발자국’이라 표현하며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런데 바위가 모래로 변하는 과정은 ‘퇴화’일까, 아니면 ‘진화’일까. 바위가 뚜렷한 이미지를 고수하며 자기 존재를 드러낸다면 모래는 사실상 바위 자신의 고유성을 상실해가는 과정이다. 그 대신 고정된 곳에서 벗어나 이동의 자유를 얻어 민들레 홀씨처럼 어디든 갈 수 있다.
씨앗의 의지보다 바람이 씨앗의 살 곳을 정해준다는 점에서 바위가 모래로 변하는 과정, 민들레 홀씨를 멀리 나르는 것도 모두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일이다.
바위야, 들어 봐
사막이 되는 방법을 알려 줄게
시간을 마셔
날마다 한 모금의 시간을 말이야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건 소용없어
날마다가 중요해
햇볕도 꾸준히 먹어 두고
바람이랑 친구처럼 지내
새들이 앉아서 갈 생각 않는다고 괜히 신경질 부리지 말고
가끔 이끼를 꺼내 입어도 좋아
준비됐어?
그럼 시작!
-김성민의 ‘사막이 되는 방법’ 전문
세월의 순리는 시간을 거스를 수 없다. 누구에게나, 바위에게도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게 순리이고 자연의 법칙이다. 사람에 대한 사랑도 순리가 좋다. 거센 소낙비처럼 쏟아부으면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린다. ‘햇볕도 꾸준히 먹어 두고 / 바람이랑 친구처럼 지내는’ 순리의 세계만이 생을 조화롭게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든다.⊙
 |
| 김남조 시인의 시집 《사람아, 사람아》 |
‘나는 시인 아니다. 시를 구걸하는 사람이다. 백기 들고 항복 항복이라며 굴복한 일이 여러 번이다’ ‘시여 한평생 나를 이기기만 하는 시여’라며 오늘에 이른 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만큼 시가, 문학이 어렵다. 마치 생이, 삶이 어렵듯이.
풍성히 은혜 주셨는데,
비어 있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솔숲의 솔잎만큼
기도말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받으셨는지요
저의 기도는
연필심처럼 허약하여
하늘 가는 중도에서 여러 번
부러졌을지 모릅니다.
그러한들 솔숲의 솔잎들이
하늘 아닌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저의 기도도
그처럼 단순합니다
-김남조의 ‘단순한 기도’ 전문
 |
| 김남조 시인의 시는 마치 기도처럼 단순하지만 사유의 깊이가 무르익었다. |
글의 진정성은 무엇인가
묻고 더 생각한다
문학이여
내 한평생 길 가고 또 가고
출발 지점에
다시 와 있구나
-김남조의 ‘책을 읽으며’ 일부
평생 글과 함께 살며 글의 행간과 행간의 의미망 속에서 자신의 생을 견주어왔지만, 시를 쓴다는 것은 늘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일이다.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고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뒤돌아보고 생을 다시 활시위에 세운다.
‘손이 많이 가는 남자’와 ‘돗자리 파는 노점 영감의 뒤태’
박현구 시인이 작년 첫 시집 《손이 많이 가는 남자》(시문학·2020)를 펴냈다. 시 ‘손이 많이 가는 남자’는 중년 남자의 고백인데 화자(話者)는 아내다.
제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이 많이 가는 남자’는 물론 시인 자신이다. ‘그 남자의 접시 위에서 / 가시를 발라주는’ 아내의 손이 ‘꿀밭의 나비처럼 제 먼저 춤을 춘다’는 표현이 약간 어리둥절하지만, 아내를 은근히 치켜세우는 시인의 능청과 해학이 느껴진다.
 |
| 박현구 시인의 첫 시집 《손이 많이 가는 남자》 |
제 손으로 아무것도 못 하는 그 남자는
냉장고의 음식도 찾아 먹지 못해
차라리 굶습니다.
마음 편히 외출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가족들을 먹여 살려 왔습니다
얼굴 검버섯을 빼며,
테이프를 갈아붙일 때도
보호 크림을 바를 때도
밉상스레 얼굴을 열흘 내내 갖다 댑니다.
시골의 동서가
시숙이 좋아한다며
살짝 말린 가자미를 보내왔어요
구운 걸 좋아하는 남자라
흥겨운 마음에 몇 마리를 구워내자
이번엔 알아서 먹어 보겠다고
돋보기를 챙기며 결기를 보이는
그 남자의 접시 위에서
가시를 발라주는 내 손이
꿀밭의 나비처럼 제 먼저 춤을 추네요
딸과 함께 웃으며 흉을 보던
참 ‘손이 많이 가는 남자’를
50년이나 공을 들여 내가 키웠나 봅니다
-박현구의 ‘손이 많이 가는 남자’ 전문
어쩌면 ‘손이 많이 가는 남자’는 우리 아버지의 자화상일지 모른다.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감정표현이 서툰 중년 남성이 많다. 표현이 미숙하니 화가 치밀어오르고 얼굴이 붉어지기 일쑤다. 그러나 속은 타들어 가고 얼마 후 후회와 실망에 몸서리친다.
시인의 아내는 그런 남편, ‘손이 많이 가는 남자’를 헌신적으로 이해해주니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언제까지 아내의 헌신에 기댈 수야 없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먼저 변해야 한다.
젊은 시인 문성해의 다섯 번째 시집 《내가 모르는 한 사람》(문학수첩·2020)도 흥미롭다. 생의 현상 이면의 것에 시인은 관심이 많다. 화려한 앞면보다 잘 안 보이는 뒤태에 눈길을 둔다. 반성적 사유를 통해 시인만이 할 수 있는 순간포착이다.
 |
| 문성해 시인의 시집 《내가 모르는 한 사람》 |
목이 기룸하고 어깨는 조붓하고 키는 중키인
뒤태에 예전에 돌아가신 선생 뒤태가 붙어 계신다
전봇대에 뭔가를 붙이는 사람 뒤에 돌아가신 삼촌이 있고
저수지에 앉아 있는 낚시꾼 뒤엔 큰아버지가 있다
마을 어귀 바위 위에도 어릴 때 잃어버린 백구의 등이 얹혀 있다.
이들은 다 한통속으로 앞을 보여 주지 않는다
봄날 오후의 언덕과
축사로 들어서는 염소들 등에도 얹혀 있는 것들
내 뒤에도 누가 붙어사는지
가다가 한참을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다.
나의 뒤에 내가 모르는 한 사람이 붙어사는 일
나는 그를 위해 밥을 주고 잠을 주고 노래를 준다
이다음 나는 풀잎의 뒤태로 살 것이다
돌아나가는 저녁연기와
강물 위로 뛰어오르는 가물치 등도 좋을 것이다
-문성해의 ‘뒤태’ 전문
가끔 길을 걷다가 누굴 닮은 뒤태를 발견하게 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부러 앞으로 다가가 슬쩍 뒤돌아본다. 물론 내가 알던 그 사람은 아니지만 ‘뒤태’는 많은 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힘이 있다. 시인은 또 다른 생을 산다면 ‘풀잎의 뒤태, 돌아나가는 저녁연기, 가물치 등’으로 살겠다고 다짐한다. 여리고 투명한 풀잎, 평화로운 저녁연기, 활력의 상징인 가물치의 뒤태를 포착한 시인의 사유가 말랑말랑하다.
변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천천히
김성민 시인의 동시집 《고향에 계신 낙타께》(창비·2021)를 서점에서 샀다. 시인이 기자에게 우편으로 보냈는데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동심을 좇는 시인의 상상력이 독자로 하여금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동시의 맛이 이런 것이구나, 탄복하게 만든다.
 |
| 김성민 시인의 동시집 《고향에 계신 낙타께》 |
커다란 덩어리에서
쪼끄만 알갱이로
꿈쩍 않는 무거움에서
작은 바람에도 굴러가는 가벼움으로
바위는 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천천히
사막을 건너가는 낙타 발자국이 될 때까지
-김성민의 ‘사막이 될 시간’ 전문
바위가 사막의 모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아주,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짧은 동시 속에 그 세월을 압축할 수 있으니 시라는 장르가 얼마나 위대한가. 시인은 ‘모래’라는 표현 대신 ‘사막을 건너는 낙타 발자국’이라 표현하며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런데 바위가 모래로 변하는 과정은 ‘퇴화’일까, 아니면 ‘진화’일까. 바위가 뚜렷한 이미지를 고수하며 자기 존재를 드러낸다면 모래는 사실상 바위 자신의 고유성을 상실해가는 과정이다. 그 대신 고정된 곳에서 벗어나 이동의 자유를 얻어 민들레 홀씨처럼 어디든 갈 수 있다.
씨앗의 의지보다 바람이 씨앗의 살 곳을 정해준다는 점에서 바위가 모래로 변하는 과정, 민들레 홀씨를 멀리 나르는 것도 모두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일이다.
 |
| 사막의 낙타.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바위가 모래가 될까. 그 모래 위에 낙타의 발자국이 찍힐까. |
사막이 되는 방법을 알려 줄게
시간을 마셔
날마다 한 모금의 시간을 말이야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건 소용없어
날마다가 중요해
햇볕도 꾸준히 먹어 두고
바람이랑 친구처럼 지내
새들이 앉아서 갈 생각 않는다고 괜히 신경질 부리지 말고
가끔 이끼를 꺼내 입어도 좋아
준비됐어?
그럼 시작!
-김성민의 ‘사막이 되는 방법’ 전문
세월의 순리는 시간을 거스를 수 없다. 누구에게나, 바위에게도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게 순리이고 자연의 법칙이다. 사람에 대한 사랑도 순리가 좋다. 거센 소낙비처럼 쏟아부으면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린다. ‘햇볕도 꾸준히 먹어 두고 / 바람이랑 친구처럼 지내는’ 순리의 세계만이 생을 조화롭게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