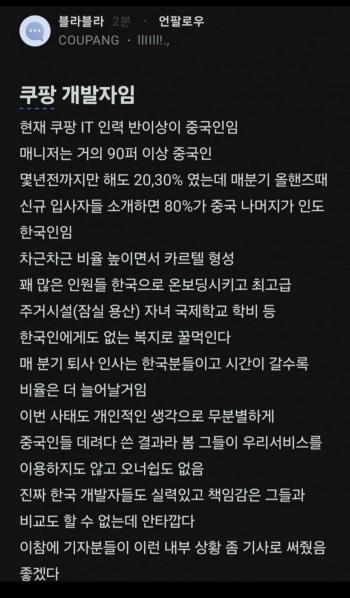⊙ 漢나라 개국공신 蕭何, 후임으로 曹參 추천… 조참은 자신의 한계 인정하고 소하의 정책 충실히 계승
⊙ 조선 개국공신 趙浚, “다른 사람의 조그만 長點이라도 반드시 취하고, 작은 허물은 묻어두었다”
⊙ 金士衡, 조준의 뒤를 이어 태종 초기의 정국 안정시켜… 태종은 조준-김사형을 소하-조참에 비유
이한우
1961년생. 고려대 영문학과 졸업, 동 대학원 철학과 석사, 한국외대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 전 《조선일보》 문화부장, 단국대 인문아카데미 주임교수 역임
⊙ 조선 개국공신 趙浚, “다른 사람의 조그만 長點이라도 반드시 취하고, 작은 허물은 묻어두었다”
⊙ 金士衡, 조준의 뒤를 이어 태종 초기의 정국 안정시켜… 태종은 조준-김사형을 소하-조참에 비유
이한우
1961년생. 고려대 영문학과 졸업, 동 대학원 철학과 석사, 한국외대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 전 《조선일보》 문화부장, 단국대 인문아카데미 주임교수 역임

- 漢나라 초기의 두 재상 소하와 조참. 조참은 전임자인 소하의 정책을 충실히 계승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속으로조차 서운해하지 않을 때라야 진정 군자가 아니겠는가?”
《논어(論語)》 학이(學而)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다. 그런데 사실 서운해하지 않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진정 자신의 본분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때에야 가능하고 동시에 홀로 있을 때에도 늘 삼가고 조심하는 신독(愼獨)을 체화(體化)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공야장(公冶長)편에서 공자가 제자들에게 각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뜻을 말해 보라고 하자 수제자인 안회(顔回)는 이렇게 말한다.
“저의 바람은 자신의 좋은 점이 있다 해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거짓이 없는 충직(忠直)함이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 그것을 줄여서 불벌(不伐)이라고 한다. 이것만 잘 유지해도 선두 주자의 뒤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
劉邦의 의심을 피한 소하
먼저 중국 한(漢)나라에서 소하(蕭何·?~기원전 193년)와 조참(曹參·?~기원전 190년)의 관계가 그렇다. 소하는 유방(劉邦)과 같은 사수(泗水) 패현(沛縣) 사람이다. 처음에 패주리연(沛主吏掾)이 됐다. 그 후에 유방을 따라 진나라 수도인 함양에 들어가 혼자 진상부(秦相府)의 율령(律令)과 도서를 수장해 천하의 요충지와 지세, 군현(郡縣)의 호구(戶口)를 소상하게 알게 됐다. 그 후에 유방이 한중(漢中)에서 왕이 되자 승상에 올랐고 한신(韓信)을 천거해 대장으로 삼아 큰 공로를 세울 수 있게 했다. 특히 그 자신이 장수는 아니었지만 막판에 초한(楚漢)이 서로 대치할 때 관중(關中)을 지키면서 군병(軍兵)과 양식의 보급을 확보, 군 물자가 부족하지 않도록 했다. 그런데 《한서(漢書)》에 보면 이런 소하조차 만일 당시 지혜로운 선비 포생(鮑生)의 조언이 아니었으면 그 끝을 잘 마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한나라 3년에 유방이 항우와 경(京・경현[京縣])과 삭(索・삭성[索城]) 땅 사이에서 서로 대치하고[距] 있을 때 유방은 여러 차례 사자를 보내 승상의 노고를 위로해 주었다. 포생이 하에게 말했다.
“지금 왕께서 햇볕에 그을리고 벌판에서 이슬을 맞고 지내면서도 여러 차례 사자를 보내 당신을 위로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해 계책을 생각해 보니 당신의 자손과 형제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은 모두 뽑아 상이 있는 군영으로 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상은 당신을 더욱 신임할 것입니다.”
이에 소하는 그의 계책에 따랐고, 한왕은 크게 기뻐했다. 그것은 소하의 복이기도 했다. 비슷한 일은 유방이 천자(天子)에 오른 이후에도 있었다.
한신과 소하, 엇갈린 운명
한나라 11년에 진희(陳豨)가 반란을 일으키자 상(한 고조 유방)은 스스로 장수가 되어 한단(邯鄲)에 이르렀다. 그런데 아직 진희의 반란을 진압하지도 못했는데 한신은 관중에서 반란을 모의했다. 여후(呂后)는 소하의 계책을 써서 한신을 주살(誅殺)했다. 유방은 한신이 이미 주살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자를 보내 소하를 승상에 제배해 상국(相國)으로 삼고 5000호를 더 봉해주었으며 병졸 500명과 1명의 도위를 보내 상국의 호위병으로 삼았다.
여러 제후가 다 축하했는데 소평(召平)만이 홀로 걱정을 털어놓았다. 소평이란 자는 원래 진나라 동릉후(東陵侯)였다. 진나라가 깨지자 평민이 되어 가난하게 지내면서 장안성 동쪽에 오이를 심었는데 그 오이가 맛이 좋아 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동릉의 오이’라고 불렀다. 이는 소평의 봉호를 따랐기 때문이다. 소평이 소하에게 말했다.
“재앙은 이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상(上)은 밖에서 햇볕에 노출되어 이슬을 맞았는데 그대는 안에서 궁궐을 지켰고 화살이나 돌을 맞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도 봉읍은 더해지고 호위 부대까지 두게 되었으니 지금 회음후(한신)가 안에서 막 반란을 일으킨 점을 볼 때 그대의 마음을 상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무릇 호위 부대를 두어 그대를 호위하는 것은 그대를 총애하는 것이 아닙니다(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호위 부대를 붙여주었다는 말이다). 바라건대 그대는 봉읍을 사양하여 결코 받지 마시고 그대의 재산을 모두 군대에 내놓으십시오.”
소하는 그 계책을 따랐고 상은 기뻐했다.
그 가을에 경포(黥布)가 반란을 일으키자 유방은 스스로 장수가 되어 그를 쳤고 여러 차례 사자를 보내 상국 소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하가 말했다.
“상께서 군대에 계실 때 백성을 안정시키느라 힘썼고, 자기가 가진 재산은 모두 군대를 돕는 데 썼으니 진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하는 논공행상에서 으뜸가는 공신이라 해 찬후(酇侯)로 봉해지고 식읍(食邑) 7000호, 일족 수십 명도 각각 식읍을 받았다. 율령제도를 정하고, 고조와 함께 진희와 한신, 경포 등을 제거한 뒤 상국에 봉해졌다. 고조가 죽자 혜제(惠帝)를 섬겼고 병이 들어 죽을 때 조참을 재상으로 천거했다.
蕭規曹隨
조참 또한 사수 패현 사람으로 원래 진나라의 옥리(獄吏)였는데 소하가 주리(主吏)로 삼았다. 진나라 말 소하와 함께 유방을 따라 병사를 일으켜 한신과 더불어 주로 군사 면에서 활약했다. 몸에 70여 개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진군(秦軍)을 공략해 한나라의 통일대업에 이바지한 공으로 건국 후인 고조 6년(기원전 201년) 평양후(平陽侯)에 책봉되고, 진희와 경포의 반란을 평정했다.
사실 그는 젊어서는 늘 소하를 따랐으나 뒤에 전쟁에서 공로를 세운 뒤에는 서운해하는 바가 있었다. 그러나 소하는 조참을 자신의 후임으로 천거했고 조참도 상국에 올라서는 소하가 했던 것을 하나도 고치지 않았다. 그래서 소하가 만든 정책을 충실히 따른다 해서 ‘소규조수(蕭規曹隨)’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이처럼 소하에 이어 조참이 그 자리를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을 보여주는 일화가 《한서(漢書)》에 실려 있다. 조참은 소하가 했던 것 말고는 새롭게 일을 하는 바가 없어 혜제는 조참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여겨 그를 불러 질책했다. 이에 조참은 관을 벗고 사죄하며 말했다.
“폐하께서 보시기에 폐하와 고황제(高皇帝・유방) 중에서 누가 더 빼어나고 굳세십니까?”
혜제가 말했다.
“짐이 어찌 감히 선제(先帝)를 바라볼 수나 있겠는가!”
조참이 말했다.
“폐하께서 보시기에 조참과 소하 중에서 누가 더 뛰어납니까?”
혜제가 말했다.
“그대가 아마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오.”
조참이 말했다.
“폐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게다가 고황제와 소하는 천하를 평정했고 법령을 이미 다 밝혀놓았습니다. 폐하께서는 팔짱만 끼시고 (조)참 등은 직무만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의 것을 따르며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 역시 좋지 않겠습니까?”
혜제가 말했다.
“좋소. 그대는 가서 쉬도록 하시오.”
조준과 이성계
한나라 건국 과정에 소하와 조참이 있어 나라를 안정시켰다면 조선에서 이에 해당하는 관계는 조준(趙浚・1346~1405년)과 김사형(金士衡・1341~1407년)이다. 조준은 고려말 혼란기에 태어났는데 증조(曾祖)는 조인규(趙仁規)로 영의정에 해당하는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냈고 아버지 조덕유(趙德裕)는 호조판서에 해당하는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냈다. 갑인년(甲寅年・1374년) 과거(科擧)에 합격해 벼슬길에 들어섰다. 이해는 공민왕이 죽던 해다. 고려말 대혼란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겸손한 성품에다 관리로서의 이재(吏才)도 뛰어났기에 빠른 승진을 거듭해 형조판서에 해당하는 전법판서(典法判書)에 올랐다. 그리고 우왕 9년이던 계해년(癸亥年・1383년) 밀직제학(密直提學)에 임명됐다. 조선시대로 치자면 승정원 승지가 된 것이다. 그러나 가까이서 지켜본 우왕의 무능과 권간(權奸)의 발호에 실망해 조준은 벼슬을 버리고 우왕 말년까지 4년 동안 은둔생활을 하면서 경사(經史)를 공부하며 윤소종(尹紹宗), 조인옥(趙仁沃) 등과 교유하면서 세상을 관망했다.
조준을 다시 세상으로 불러낸 것은 무진년(戊辰年・1388년)에 일어난 이성계(李成桂) 장군의 위화도 회군(回軍)이었다. 이성계는 회군에 성공해 조정을 장악하고서 쌓인 폐단을 쓸어버리고 모든 정치를 일신(一新)하려고 했다. 이때 조준이 중망(重望)이 있다는 말을 듣고 불러들여 함께 일을 이야기해 본 다음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겸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발탁했다. 실록에 따르면 이성계는 조준에게 “크고 작은 일 없이 모두 물어서 했다”고 한다. 조준도 감격하여 “생각하고 아는 것이 있으면 말하지 아니함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준은 뜻도 컸지만 일에도 밝았다. 정치와 정책 모두에 능한 인물이었다.
1392년 7월 마침내 조준은 여러 장상(將相)을 거느리고 이성계를 추대했다. 얼마 후 이성계가 공신들을 불러 세자를 누구로 세울지 의견을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조준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세상이 태평하면 적장자(嫡長子)를 먼저 하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공(功)이 있는 이를 먼저 하오니 바라건대 다시 세 번 생각하소서.”
이방원(李芳遠・태종)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이때 왕비 강씨가 이를 엿들어 알고 그 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다. 이성계는 조준에게 강씨 소생인 이방번의 이름을 쓰게 하니 조준은 땅에 엎드려 쓰지 않았다. 이성계는 강씨의 어린 아들 이방석(李芳碩)을 세자로 삼았다.
이성계는 묘하게도 정도전(鄭道傳)을 아꼈으면서도 그를 정승에 앉히지는 않았다. 실록의 한 대목이다.
“도전(道傳)이 또 준(浚)을 대신하여 정승(政丞)이 되려고 하여 남은과 함께 늘 태상왕(이성계)에게 준의 단점을 말했으나 태상왕이 조준을 대접하기를 더욱 두텁게 하였다.”
이성계도 정도전을 정승감으로는 보지 않았던 것이다.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은 거사의 와중에 박포(朴苞)를 보내 조준을 부르고 또 스스로 길에 나와서 맞았다. 그리고 훗날의 정종을 내세워 일단 이성계로부터 왕위를 넘겨받는 계책을 낸 주인공도 조준이다.
물론 태종 재위 기간 내내 가장 막강했던 정승은 하륜(河崙)이다. 그러나 여말선초(麗末鮮初) 그리고 태조-정종-태종으로 이어지는 격변기에 고비마다 태종 이방원을 뒷받침한 인물은 조준이다. 실록은 조준에 대해 이렇게 증언한다.
“다른 사람의 조그만 장점(長點)이라도 반드시 취(取)하고, 작은 허물은 묻어두었다.”
한신을 천거한 소하를 떠올리는 대목이다. 그랬기에 태종은 그가 죽은 뒤에도 뛰어난 정승[賢相]을 평론할 때에 풍도(風度)와 기개(氣槪)는 반드시 조준을 으뜸으로 삼고 항상 ‘조 정승(趙政丞)’이라 칭했지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한 번도 탄핵당하지 않은 김사형
조선 초 정승을 열거할 때 조준, 하륜은 알아도 김사형을 아는 이는 드물다. 그러나 태조 정권 내내 최고 실권자인 좌의정 혹은 좌정승이 조준이었다면 그와 보조를 맞춰 내내 우의정 혹은 우정승으로 있었던 인물이 김사형이다.
김사형은 고려 때의 명장이자 충신으로 문무겸전을 했던 재상 김방경(金方慶)의 현손(玄孫)으로 여말선초의 명문세가 출신이다.
사형은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해 조준 등과 함께 대간을 지냈다. 이때 맺은 교분으로 그의 정치 노선은 단 한 번도 조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조준을 섬긴 때문이 아니라 조준의 노선이 옳다는 굳은 믿음 때문이었다.
1407년(태종 7년) 7월 30일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실록은 그의 인품을 이렇게 평하고 있다.
“깊고 침착하여 지혜가 있었고, 조용하고 중후하여 말이 적었으며, 속으로 남에게 숨기는 것이 없고, 밖으로 남에게 모나는 것이 없었다. 재산을 경영하지 않고 성색(聲色)을 좋아하지 않아서 처음 벼슬할 때부터 운명할 때까지 한 번도 탄핵을 당하지 않았으니 시작도 잘하고 마지막을 좋게 마친 것[善始令終]이 이와 비교할 만한 이가 드물다.”
그는 무엇보다 관리로서의 능력이 출중했다. 태조 4년(1395년) 12월 20일 《태조실록》의 짧은 기사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좌정승 조준, 우정승 김사형, 삼사판사(三司判事) 정도전에게 각각 칼 한 자루씩을 주었다.”
삼사판사, 훗날의 호조판서에 가까운 이 자리가 정도전이 가장 높이 올라간 관직이다. 그런데 왜? 일차적으로는 조준의 반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김사형이 우의정 자리를 누구보다 잘 맡아서 했기 때문이다. 좌의정도 우의정을 거쳐야 올라갈 수 있는데 업무 능력에서 정도전은 결국 김사형 이상의 신뢰를 태조 이성계에게 심어주지 못했던 것이다. 실록의 평가다.
환상의 콤비
“젊어서 화요직(華要職)을 두루 거쳤으나 이르는 데마다 직책을 잘 수행하였다. 무진년(1392년) 가을에 태상왕이 국사를 담당하여 서정(庶政)을 일신하고 대신을 나누어 보내 각 지방을 전제(專制)하게 하였을 때 김사형은 교주 강릉도 도관찰출척사(交州江陵道都觀察黜陟使)가 되어 부내(部內)를 잘 다스렸다. 경오년에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로서 대사헌(大司憲)을 겸하였고 조금 뒤에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로 승진하였다. 대헌(臺憲)에 있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조정이 숙연(肅然)해졌다.”
탁월한 실무 능력과 분수를 아는 처신은 그를 우정승에 그치게 하지 않았다. 조준과 김사형의 관계를 실록은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하고 있다.
“조준은 강직하고 과감하여 거리낌 없이 국정(國政)을 전단(專斷)하고, 김사형은 관대하고 간요한 것으로 이를 보충하여 앉아서 묘당(廟堂)을 진압했다.”
흔히 말하는 환상의 콤비였던 셈이다. 그래서 태종 초에는 드디어 좌정승에 오른다. 이미 왕권(王權) 중심의 정치를 구상하고 있던 태종으로서는 모든 것이 불안정할 때 김사형의 지혜가 필요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태종의 최측근인 하륜에게 좌정승 자리를 넘긴다.
그러나 개국 과정이나 1차 왕자의 난 때 적극적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김사형의 정치적 약점이 됐다. 태종 10년(1410년) 7월 12일 태조를 종묘에 모시면서 배향(配享)공신을 토의하는데 이때 김사형은 배향공신에 오르지 못한다. 그날의 장면으로 들어가 보자.
김사형의 배향 여부에 대해 태종이 하륜에게 물으니 이렇게 답했다.
“임금이 신하에게 물으면 신하는 감히 바르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사형은 공이 없으니 배향함이 마땅치 않습니다.”
의정부에서도 아뢰었다.
“김사형은 가문이 귀하고 현달하며 심지(心地)가 청고(淸高)하기 때문에 태조께서 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본래 개국(開國)의 모획(謀劃)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또 모든 처치(處置)를 한결같이 조준만 따르고 가타부타 하는 일이 없었으니 배향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배향되지 않았다. 조준만 배향공신에 올랐다. 그것이 어쩌면 선구자의 길을 따라만 간 후진의 한계였는지 모른다.
태종의 평가
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던 태종은 이듬해인 1411년 3월 28일 상왕이 머무는 인덕궁(仁德宮)에 나아가 헌수(獻壽)했다. 술이 거나해지자 상당군(上黨君) 이애(李薆)가 연구(聯句)를 지어 올렸다.
“요(堯) 순(舜)이 함께 즐겨 서로 같이 헌수(獻壽)하도다.”
이에 태종이 대구(對句)했다.
“소하와 조참이 오늘 다시 공(功)을 이루었도다.”
당연히 소하와 조참은 조준과 김사형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물론 소하와 조참, 조준과 김사형의 대비관계를 모른다면 태종의 대구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논어(論語)》 학이(學而)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다. 그런데 사실 서운해하지 않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진정 자신의 본분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때에야 가능하고 동시에 홀로 있을 때에도 늘 삼가고 조심하는 신독(愼獨)을 체화(體化)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공야장(公冶長)편에서 공자가 제자들에게 각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뜻을 말해 보라고 하자 수제자인 안회(顔回)는 이렇게 말한다.
“저의 바람은 자신의 좋은 점이 있다 해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거짓이 없는 충직(忠直)함이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 그것을 줄여서 불벌(不伐)이라고 한다. 이것만 잘 유지해도 선두 주자의 뒤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
劉邦의 의심을 피한 소하
먼저 중국 한(漢)나라에서 소하(蕭何·?~기원전 193년)와 조참(曹參·?~기원전 190년)의 관계가 그렇다. 소하는 유방(劉邦)과 같은 사수(泗水) 패현(沛縣) 사람이다. 처음에 패주리연(沛主吏掾)이 됐다. 그 후에 유방을 따라 진나라 수도인 함양에 들어가 혼자 진상부(秦相府)의 율령(律令)과 도서를 수장해 천하의 요충지와 지세, 군현(郡縣)의 호구(戶口)를 소상하게 알게 됐다. 그 후에 유방이 한중(漢中)에서 왕이 되자 승상에 올랐고 한신(韓信)을 천거해 대장으로 삼아 큰 공로를 세울 수 있게 했다. 특히 그 자신이 장수는 아니었지만 막판에 초한(楚漢)이 서로 대치할 때 관중(關中)을 지키면서 군병(軍兵)과 양식의 보급을 확보, 군 물자가 부족하지 않도록 했다. 그런데 《한서(漢書)》에 보면 이런 소하조차 만일 당시 지혜로운 선비 포생(鮑生)의 조언이 아니었으면 그 끝을 잘 마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한나라 3년에 유방이 항우와 경(京・경현[京縣])과 삭(索・삭성[索城]) 땅 사이에서 서로 대치하고[距] 있을 때 유방은 여러 차례 사자를 보내 승상의 노고를 위로해 주었다. 포생이 하에게 말했다.
“지금 왕께서 햇볕에 그을리고 벌판에서 이슬을 맞고 지내면서도 여러 차례 사자를 보내 당신을 위로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해 계책을 생각해 보니 당신의 자손과 형제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은 모두 뽑아 상이 있는 군영으로 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상은 당신을 더욱 신임할 것입니다.”
이에 소하는 그의 계책에 따랐고, 한왕은 크게 기뻐했다. 그것은 소하의 복이기도 했다. 비슷한 일은 유방이 천자(天子)에 오른 이후에도 있었다.
한신과 소하, 엇갈린 운명
한나라 11년에 진희(陳豨)가 반란을 일으키자 상(한 고조 유방)은 스스로 장수가 되어 한단(邯鄲)에 이르렀다. 그런데 아직 진희의 반란을 진압하지도 못했는데 한신은 관중에서 반란을 모의했다. 여후(呂后)는 소하의 계책을 써서 한신을 주살(誅殺)했다. 유방은 한신이 이미 주살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자를 보내 소하를 승상에 제배해 상국(相國)으로 삼고 5000호를 더 봉해주었으며 병졸 500명과 1명의 도위를 보내 상국의 호위병으로 삼았다.
여러 제후가 다 축하했는데 소평(召平)만이 홀로 걱정을 털어놓았다. 소평이란 자는 원래 진나라 동릉후(東陵侯)였다. 진나라가 깨지자 평민이 되어 가난하게 지내면서 장안성 동쪽에 오이를 심었는데 그 오이가 맛이 좋아 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동릉의 오이’라고 불렀다. 이는 소평의 봉호를 따랐기 때문이다. 소평이 소하에게 말했다.
“재앙은 이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상(上)은 밖에서 햇볕에 노출되어 이슬을 맞았는데 그대는 안에서 궁궐을 지켰고 화살이나 돌을 맞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도 봉읍은 더해지고 호위 부대까지 두게 되었으니 지금 회음후(한신)가 안에서 막 반란을 일으킨 점을 볼 때 그대의 마음을 상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무릇 호위 부대를 두어 그대를 호위하는 것은 그대를 총애하는 것이 아닙니다(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호위 부대를 붙여주었다는 말이다). 바라건대 그대는 봉읍을 사양하여 결코 받지 마시고 그대의 재산을 모두 군대에 내놓으십시오.”
소하는 그 계책을 따랐고 상은 기뻐했다.
그 가을에 경포(黥布)가 반란을 일으키자 유방은 스스로 장수가 되어 그를 쳤고 여러 차례 사자를 보내 상국 소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하가 말했다.
“상께서 군대에 계실 때 백성을 안정시키느라 힘썼고, 자기가 가진 재산은 모두 군대를 돕는 데 썼으니 진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하는 논공행상에서 으뜸가는 공신이라 해 찬후(酇侯)로 봉해지고 식읍(食邑) 7000호, 일족 수십 명도 각각 식읍을 받았다. 율령제도를 정하고, 고조와 함께 진희와 한신, 경포 등을 제거한 뒤 상국에 봉해졌다. 고조가 죽자 혜제(惠帝)를 섬겼고 병이 들어 죽을 때 조참을 재상으로 천거했다.
蕭規曹隨
조참 또한 사수 패현 사람으로 원래 진나라의 옥리(獄吏)였는데 소하가 주리(主吏)로 삼았다. 진나라 말 소하와 함께 유방을 따라 병사를 일으켜 한신과 더불어 주로 군사 면에서 활약했다. 몸에 70여 개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진군(秦軍)을 공략해 한나라의 통일대업에 이바지한 공으로 건국 후인 고조 6년(기원전 201년) 평양후(平陽侯)에 책봉되고, 진희와 경포의 반란을 평정했다.
사실 그는 젊어서는 늘 소하를 따랐으나 뒤에 전쟁에서 공로를 세운 뒤에는 서운해하는 바가 있었다. 그러나 소하는 조참을 자신의 후임으로 천거했고 조참도 상국에 올라서는 소하가 했던 것을 하나도 고치지 않았다. 그래서 소하가 만든 정책을 충실히 따른다 해서 ‘소규조수(蕭規曹隨)’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이처럼 소하에 이어 조참이 그 자리를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을 보여주는 일화가 《한서(漢書)》에 실려 있다. 조참은 소하가 했던 것 말고는 새롭게 일을 하는 바가 없어 혜제는 조참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여겨 그를 불러 질책했다. 이에 조참은 관을 벗고 사죄하며 말했다.
“폐하께서 보시기에 폐하와 고황제(高皇帝・유방) 중에서 누가 더 빼어나고 굳세십니까?”
혜제가 말했다.
“짐이 어찌 감히 선제(先帝)를 바라볼 수나 있겠는가!”
조참이 말했다.
“폐하께서 보시기에 조참과 소하 중에서 누가 더 뛰어납니까?”
혜제가 말했다.
“그대가 아마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오.”
조참이 말했다.
“폐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게다가 고황제와 소하는 천하를 평정했고 법령을 이미 다 밝혀놓았습니다. 폐하께서는 팔짱만 끼시고 (조)참 등은 직무만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의 것을 따르며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 역시 좋지 않겠습니까?”
혜제가 말했다.
“좋소. 그대는 가서 쉬도록 하시오.”
조준과 이성계
한나라 건국 과정에 소하와 조참이 있어 나라를 안정시켰다면 조선에서 이에 해당하는 관계는 조준(趙浚・1346~1405년)과 김사형(金士衡・1341~1407년)이다. 조준은 고려말 혼란기에 태어났는데 증조(曾祖)는 조인규(趙仁規)로 영의정에 해당하는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냈고 아버지 조덕유(趙德裕)는 호조판서에 해당하는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냈다. 갑인년(甲寅年・1374년) 과거(科擧)에 합격해 벼슬길에 들어섰다. 이해는 공민왕이 죽던 해다. 고려말 대혼란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겸손한 성품에다 관리로서의 이재(吏才)도 뛰어났기에 빠른 승진을 거듭해 형조판서에 해당하는 전법판서(典法判書)에 올랐다. 그리고 우왕 9년이던 계해년(癸亥年・1383년) 밀직제학(密直提學)에 임명됐다. 조선시대로 치자면 승정원 승지가 된 것이다. 그러나 가까이서 지켜본 우왕의 무능과 권간(權奸)의 발호에 실망해 조준은 벼슬을 버리고 우왕 말년까지 4년 동안 은둔생활을 하면서 경사(經史)를 공부하며 윤소종(尹紹宗), 조인옥(趙仁沃) 등과 교유하면서 세상을 관망했다.
조준을 다시 세상으로 불러낸 것은 무진년(戊辰年・1388년)에 일어난 이성계(李成桂) 장군의 위화도 회군(回軍)이었다. 이성계는 회군에 성공해 조정을 장악하고서 쌓인 폐단을 쓸어버리고 모든 정치를 일신(一新)하려고 했다. 이때 조준이 중망(重望)이 있다는 말을 듣고 불러들여 함께 일을 이야기해 본 다음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겸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발탁했다. 실록에 따르면 이성계는 조준에게 “크고 작은 일 없이 모두 물어서 했다”고 한다. 조준도 감격하여 “생각하고 아는 것이 있으면 말하지 아니함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준은 뜻도 컸지만 일에도 밝았다. 정치와 정책 모두에 능한 인물이었다.
1392년 7월 마침내 조준은 여러 장상(將相)을 거느리고 이성계를 추대했다. 얼마 후 이성계가 공신들을 불러 세자를 누구로 세울지 의견을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조준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세상이 태평하면 적장자(嫡長子)를 먼저 하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공(功)이 있는 이를 먼저 하오니 바라건대 다시 세 번 생각하소서.”
이방원(李芳遠・태종)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이때 왕비 강씨가 이를 엿들어 알고 그 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다. 이성계는 조준에게 강씨 소생인 이방번의 이름을 쓰게 하니 조준은 땅에 엎드려 쓰지 않았다. 이성계는 강씨의 어린 아들 이방석(李芳碩)을 세자로 삼았다.
이성계는 묘하게도 정도전(鄭道傳)을 아꼈으면서도 그를 정승에 앉히지는 않았다. 실록의 한 대목이다.
“도전(道傳)이 또 준(浚)을 대신하여 정승(政丞)이 되려고 하여 남은과 함께 늘 태상왕(이성계)에게 준의 단점을 말했으나 태상왕이 조준을 대접하기를 더욱 두텁게 하였다.”
이성계도 정도전을 정승감으로는 보지 않았던 것이다.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은 거사의 와중에 박포(朴苞)를 보내 조준을 부르고 또 스스로 길에 나와서 맞았다. 그리고 훗날의 정종을 내세워 일단 이성계로부터 왕위를 넘겨받는 계책을 낸 주인공도 조준이다.
물론 태종 재위 기간 내내 가장 막강했던 정승은 하륜(河崙)이다. 그러나 여말선초(麗末鮮初) 그리고 태조-정종-태종으로 이어지는 격변기에 고비마다 태종 이방원을 뒷받침한 인물은 조준이다. 실록은 조준에 대해 이렇게 증언한다.
“다른 사람의 조그만 장점(長點)이라도 반드시 취(取)하고, 작은 허물은 묻어두었다.”
한신을 천거한 소하를 떠올리는 대목이다. 그랬기에 태종은 그가 죽은 뒤에도 뛰어난 정승[賢相]을 평론할 때에 풍도(風度)와 기개(氣槪)는 반드시 조준을 으뜸으로 삼고 항상 ‘조 정승(趙政丞)’이라 칭했지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한 번도 탄핵당하지 않은 김사형
조선 초 정승을 열거할 때 조준, 하륜은 알아도 김사형을 아는 이는 드물다. 그러나 태조 정권 내내 최고 실권자인 좌의정 혹은 좌정승이 조준이었다면 그와 보조를 맞춰 내내 우의정 혹은 우정승으로 있었던 인물이 김사형이다.
김사형은 고려 때의 명장이자 충신으로 문무겸전을 했던 재상 김방경(金方慶)의 현손(玄孫)으로 여말선초의 명문세가 출신이다.
사형은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해 조준 등과 함께 대간을 지냈다. 이때 맺은 교분으로 그의 정치 노선은 단 한 번도 조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조준을 섬긴 때문이 아니라 조준의 노선이 옳다는 굳은 믿음 때문이었다.
1407년(태종 7년) 7월 30일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실록은 그의 인품을 이렇게 평하고 있다.
“깊고 침착하여 지혜가 있었고, 조용하고 중후하여 말이 적었으며, 속으로 남에게 숨기는 것이 없고, 밖으로 남에게 모나는 것이 없었다. 재산을 경영하지 않고 성색(聲色)을 좋아하지 않아서 처음 벼슬할 때부터 운명할 때까지 한 번도 탄핵을 당하지 않았으니 시작도 잘하고 마지막을 좋게 마친 것[善始令終]이 이와 비교할 만한 이가 드물다.”
그는 무엇보다 관리로서의 능력이 출중했다. 태조 4년(1395년) 12월 20일 《태조실록》의 짧은 기사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좌정승 조준, 우정승 김사형, 삼사판사(三司判事) 정도전에게 각각 칼 한 자루씩을 주었다.”
삼사판사, 훗날의 호조판서에 가까운 이 자리가 정도전이 가장 높이 올라간 관직이다. 그런데 왜? 일차적으로는 조준의 반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김사형이 우의정 자리를 누구보다 잘 맡아서 했기 때문이다. 좌의정도 우의정을 거쳐야 올라갈 수 있는데 업무 능력에서 정도전은 결국 김사형 이상의 신뢰를 태조 이성계에게 심어주지 못했던 것이다. 실록의 평가다.
환상의 콤비
“젊어서 화요직(華要職)을 두루 거쳤으나 이르는 데마다 직책을 잘 수행하였다. 무진년(1392년) 가을에 태상왕이 국사를 담당하여 서정(庶政)을 일신하고 대신을 나누어 보내 각 지방을 전제(專制)하게 하였을 때 김사형은 교주 강릉도 도관찰출척사(交州江陵道都觀察黜陟使)가 되어 부내(部內)를 잘 다스렸다. 경오년에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로서 대사헌(大司憲)을 겸하였고 조금 뒤에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로 승진하였다. 대헌(臺憲)에 있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조정이 숙연(肅然)해졌다.”
탁월한 실무 능력과 분수를 아는 처신은 그를 우정승에 그치게 하지 않았다. 조준과 김사형의 관계를 실록은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하고 있다.
“조준은 강직하고 과감하여 거리낌 없이 국정(國政)을 전단(專斷)하고, 김사형은 관대하고 간요한 것으로 이를 보충하여 앉아서 묘당(廟堂)을 진압했다.”
흔히 말하는 환상의 콤비였던 셈이다. 그래서 태종 초에는 드디어 좌정승에 오른다. 이미 왕권(王權) 중심의 정치를 구상하고 있던 태종으로서는 모든 것이 불안정할 때 김사형의 지혜가 필요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태종의 최측근인 하륜에게 좌정승 자리를 넘긴다.
그러나 개국 과정이나 1차 왕자의 난 때 적극적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김사형의 정치적 약점이 됐다. 태종 10년(1410년) 7월 12일 태조를 종묘에 모시면서 배향(配享)공신을 토의하는데 이때 김사형은 배향공신에 오르지 못한다. 그날의 장면으로 들어가 보자.
김사형의 배향 여부에 대해 태종이 하륜에게 물으니 이렇게 답했다.
“임금이 신하에게 물으면 신하는 감히 바르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사형은 공이 없으니 배향함이 마땅치 않습니다.”
의정부에서도 아뢰었다.
“김사형은 가문이 귀하고 현달하며 심지(心地)가 청고(淸高)하기 때문에 태조께서 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본래 개국(開國)의 모획(謀劃)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또 모든 처치(處置)를 한결같이 조준만 따르고 가타부타 하는 일이 없었으니 배향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배향되지 않았다. 조준만 배향공신에 올랐다. 그것이 어쩌면 선구자의 길을 따라만 간 후진의 한계였는지 모른다.
태종의 평가
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던 태종은 이듬해인 1411년 3월 28일 상왕이 머무는 인덕궁(仁德宮)에 나아가 헌수(獻壽)했다. 술이 거나해지자 상당군(上黨君) 이애(李薆)가 연구(聯句)를 지어 올렸다.
“요(堯) 순(舜)이 함께 즐겨 서로 같이 헌수(獻壽)하도다.”
이에 태종이 대구(對句)했다.
“소하와 조참이 오늘 다시 공(功)을 이루었도다.”
당연히 소하와 조참은 조준과 김사형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물론 소하와 조참, 조준과 김사형의 대비관계를 모른다면 태종의 대구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