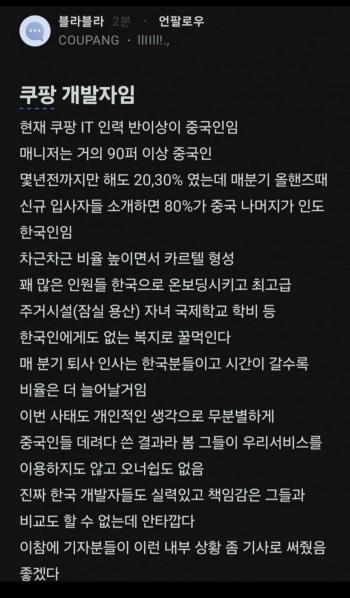⊙ 17세의 나이로 일본에 들어가 일본어와 문화 습득… 도요토미 히데요시·도쿠가와 이에야스 등과 친분 맺고 예수회 확장에 기여
⊙ 《일본어문전》 《일본교회사》 등 남긴 ‘日本學’의 선구자
⊙ 일본에서 추방된 후 중국 선교에 동참… 조선 사신 정두원과 만나 천리경·자명종 등 전파
신상목
1970년생. 연세대 법대 졸업, 외시 30회 합격 / 주일대사관 1등 서기관, 외교부 G20정상회의 행사기획과장,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의전과장 역임. 현 기리야마 대표 / 저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
⊙ 《일본어문전》 《일본교회사》 등 남긴 ‘日本學’의 선구자
⊙ 일본에서 추방된 후 중국 선교에 동참… 조선 사신 정두원과 만나 천리경·자명종 등 전파
신상목
1970년생. 연세대 법대 졸업, 외시 30회 합격 / 주일대사관 1등 서기관, 외교부 G20정상회의 행사기획과장,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의전과장 역임. 현 기리야마 대표 / 저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

- ‘일본학’의 선구자가 된 포르투갈 신부 조앙 로드리게즈.
16세기 중반 이래 유럽과 일본 사이의 교류는 예수회에 의한 기독교 전파가 중심에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일본에 기독교를 최초로 전파한 사비에르, 《일본사》를 저술하여 일본의 사정을 서양에 본격적으로 알린 프로이스, ‘적응주의’를 통해 일본 내 기독교 확산에 크게 기여한 발리냐노 등이 역사적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사실 일본 내 예수회 활동에 있어 가장 독특하고도 흥미로운 인물 중의 하나가 조앙 로드리게즈 신부이다.
로드리게즈 신부는 소년 시절 일본에 건너와 30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며, 일본의 언어・생활・문화를 체화하여 가장 현지화된 사제로 일본의 조야(朝野)를 누빈 인물이다. 로드리게즈 신부는 동(同)시대 중국에서 활약한 동명이인 ‘조앙 지랑 로드리게즈’(João Girão Rodrigues) 신부와 구별하기 위해 ‘조앙 츠주 로드리게즈’(João Tçuzu Rodrigues)로 불린다. ‘츠주’(Tçuzu)는 이름이 아니라 일종의 수식어로, 일본어 통사(通事, 일본어 발음 ‘츠지’)에서 온 말이다. 통사는 오늘날로 치면 통역사이다. 통사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그의 일본어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었고, 그는 뛰어난 일본어 능력을 바탕으로 후세에 길이 남을 체계적 일본어 연구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17살 때 일본에 건너와
1577년(1576년이라는 기록도 있다) 로드리게즈 신부가 일본에 건너왔을 때 그는 17세에 불과한 소년이었다. 포르투갈의 바이라(Beira) 지방 출신인 그가 어떠한 경로로 어린 나이에 일본에 오게 되었는지는 기록이 없다. 당시 15세 전후의 나이에 뱃사람이 되어 무역선을 타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었기에, 그 역시 돈벌이를 위해 동방 무역선의 선원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수회 측의 기록에 따르면 로드리게즈는 1574년 포르투갈을 떠나 인도 고아, 마카오를 거쳐 규슈의 분고(豊後, 지금의 오이타·大分현)에 도착하여 일본 생활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분고의 영주인 오토모 소린(大友宗麟)은 개종(改宗)에 반대하는 아내와 이혼을 불사하면서까지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대표적 ‘기리시탄 다이묘’였다. 당시 분고 일대에는 오토모의 후원하에 예수회가 포교 기반 확대를 위해 콜레지오(고등신학교), 노비시아테(예비 수련원) 등의 신학교들을 속속 설립하고 있었다.
로드리게즈는 20세가 되던 1580년, 예수회의 일원이 되어 이들 신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당시 일본에 설치된 신학교는 발리냐노의 발안(發案)으로 ‘적응주의’ 교육방침을 채택하고 있었다. 적응주의란 비(非)기독교 지역 포교 시 현지의 언어・문화・습관을 철저히 익힌 후, 그 바탕 위에 현지인들이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선교에 나선다는 발상이다. 그를 위해서는 현지에서 사제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긴요하였고, 이들 교육기관에서는 신학·철학·자연과학· 라틴어 등의 기본 과목에 대한 교수(敎授) 외에 현지의 언어·역사·문화 습득을 통한 현지화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분고 일대의 신학교에서는 발리냐노가 스스로 교편을 잡으며 사제들의 현지화를 독려하였고, 기독교로 개종한 일본의 유식자(有識者)들이 일본의 언어·역사·문화의 길라잡이기 되어 주었다.
유럽인과 일본인이 뒤섞여 체계적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로드리게즈의 학식은 일취월장한다. 특히 로드리게즈의 일본어는 성인이 되어 일본어를 습득하기 시작한 여타 사제들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최상급 수준이었다. 일본의 역사·고전·문화 지식을 바탕으로 고사(古事) 인용과 한자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그의 일본어 능력은 일본인들도 깜짝 놀랄 수준이었다고 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로드리게즈
일본을 떠나 고아에 머무르던 발리냐노는 그곳에서 재회한 견구(遣歐) 소년사절단을 동반하여 1590년 재차 도일(渡日)한다. 1590년의 일본 방문은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3년 전인 158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돌연 ‘바텐레 추방령’(기독교 사제 추방령)을 내리고 기독교 탄압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발리냐노는 단순한 예수회 사제가 아닌 인도 부왕(副王·총독) 사절의 자격을 얻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직접 알현하고, 그의 의중을 살펴 포교 재개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였다.
이때 발리냐노의 통역사로 로드리게즈가 발탁된다. 그 전까지는 자타 공인 최고의 일본 전문가 프로이스가 통역을 맡았으나, 노쇠한 프로이스를 대신하여 로드리게즈가 중책을 부여받은 것이다. 발리냐노가 1년을 기다려 성사된 히데요시와의 만남에서 통역을 맡은 로드리게즈는 일본인 뺨치는 유려한 일본어로 히데요시를 매료시킨다. 로드리게즈의 유창한 일본어에 감탄한 히데요시가 로드리게즈를 따로 불러 단독 면담을 가질 정도였다. 이때 시작된 히데요시와 로드리게즈의 인연은 히데요시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이어진다.
히데요시의 기독교 탄압 움직임에 숨을 죽이며 수면하에서 활동해야 했던 예수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 인도 부왕 사절 자격으로 히데요시의 일본 통일 위업을 경하(慶賀)하고 성대한 선물을 봉정(奉呈)하며 히데요시의 환심을 사는 한편, 포르투갈 무역 이권을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삼아 추방령을 철회하고 운신의 폭을 넓히려 했다. 그러한 일련의 교섭 활동에 로드리게즈가 깊숙이 개입하게 된 것이다.
히데요시는 만년(晩年)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사제들을 스페인·포르투갈 제국의 일본 침략 도구로 의심하며 경원시하였으나, 로드리게즈만은 예외로 후대하며 가까이 두었다. 그러나 로드리게즈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히데요시의 기독교 세력에 대한 의심은 누그러질 줄 몰랐고, 오히려 1597년 2월 나가사키의 ‘26 성인(聖人) 순교사건’으로 기독교인에 대해 극형을 불사하는 가혹한 박해가 본격화된다.
1598년 9월 히데요시는 교토의 후시미(伏見)성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한다. 히데요시는 숨을 거두기 며칠 전 로드리게즈를 거소로 따로 불러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한다. 로드리게즈는 죽음을 눈앞에 둔 속세의 권력자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을 권했으나, 히데요시는 묵묵부답인 채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진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무역 대리인 역할
히데요시 사후(死後) 예수회는 권력의 일대 지각변동을 예의 주시하며, 포교 탄압의 분위기 전환을 위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로드리게즈는 1598년 말 예수회 일본 교구의 차석 고위직에 해당하는 ‘대리 사제’(procurador)에 임명된다. 대리 사제는 교구의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일본에서는 그를 ‘재무 담당 사제’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당시 예수회 일본교구의 재정은 만성적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히데요시의 조선 침공과 그의 사후 권력투쟁 과정에서 포르투갈 무역선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다. 재정난에 고심하던 로드리게즈는 권력 쟁패에 나선 유력자들에게 포르투갈 무역 이권을 연계시키는 중개역을 통해 재정난을 타개하고자 했다. 일본 사정에 정통한 로드리게즈는 천하통일에 다가선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와 돈독한 관계를 맺는 데 주력한다.
이에야스와 로드리게즈는 1593년 규슈의 나고야(名護屋)성에서 이미 만난 적이 있는 사이였다. 이에야스는 당시 유창한 일본어로 기독교 교리를 불교 교리에 빗대어 설명하는 이국인 신부를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은 후, 이에야스의 지우(知遇)를 얻은 로드리게즈는 쇼군의 실질적 무역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당시 가장 중요한 교역품은 생사(生絲)였다. 로드리게즈는 생사 수급 과정에서 가격・물량・판매처 결정 등에 깊숙이 간여하게 되면서 쇼군·다이묘·일본 상인·포르투갈 상인의 이익이 교차하는 4파 구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로마와 고아의 예수회 상부는 상부대로 무역 이권(利權)에 개입하는 것은 성행(聖行)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로드리게즈의 처사에 비판적이었고, 라이벌 관계에 있는 프란체스코회 사제들은 더욱 직접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로드리게즈로서는 고립무원,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황이었다.
추방
결국 ‘마드레 데 데우스 사건(《월간조선》 11월호 〈‘노싸 세뇨라 다 그라사’호 폭침사건〉)’이 화근이 되어 로드리게즈의 신변에 큰 변화가 발생한다. 데우스호 사건에 관한 대부분의 정황은 사실 예수회가 남긴 기록으로 파악된 것이다. 그러나 어인 일인지 일본 기록에는 있는 데우스호와 관련된 로드리게즈의 기록이 예수회 기록에는 언급이 없다. 이를테면 로드리게즈가 데우스호와 일본측 간의 생사 거래 중개역을 맡은 사정이나, 그가 이에야스 알현을 위해 슨푸(駿府)를 방문한 데우스호 사절을 인솔한 사실 등이 예수회 기록에는 누락된 것이다.
데우스호 사건이 발생한 1610년 로드리게즈는 돌연 마카오로 추방된다. 이에야스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던 로드리게즈가 어떠한 이유로 추방을 당했는지 명확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없다. 훗날 예수회 사제 비에이라(Francisco Vieira)가 작성한 보고서 중에 “로드리게즈 신부는 일본 권력 중추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가사키의 무역과 내부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실수를 저지름으로써 많은 적을 만들었고, 끝내 그 적들의 부당한 박해에 의해 일본을 떠나야만 했다”는 언급 정도가 남아 있을 뿐이다.
역사가들의 해석은 두 갈래로 나뉜다. 로드리게즈에 의해 이권을 위협받은 나가사키 부교 하세가와(長谷川) 등이 로드리게즈를 데우스호 사건의 책임자로 무고(誣告)하여 이에야스의 눈밖에 나게 되었다는 해석과, 반대로 로드리게즈가 실제 이에야스의 이익보다 포르투갈과 예수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부정직한 중개를 하는 정황이 발각되어 이에야스의 노여움을 샀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진실이 무엇이든, 당시 이에야스는 주인선(朱印船) 무역과 아울러 스페인·네덜란드·영국 등 생사 대체 공급원 확보에 자신감을 갖고 포르투갈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교역 주도권을 쥐고자 하던 차였다. 안팎이 적으로 둘러싸인 로드리게즈는 언제든지 상황 변화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처지였다. 그러잖아도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던 예수회 일본교구는 가장 든든한 현지 권력자와의 연결고리인 로드리게즈를 잃게 됨으로써 급속하게 일본 내에서의 영향력이 쇠퇴한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영국의 윌리엄 애덤스와 네덜란드의 얀 요스텐 등 신교(新敎)국가 출신 유럽인들이었다.
‘日本學’ 연구의 선구자
무역 이권 개입 의혹으로 불운의 추방을 당한 사정과 별개로, 로드리게즈가 일본 활동을 통해 남긴 가장 큰 업적은 그의 뛰어난 지적 능력이 돋보이는 ‘일본학’ 연구이다. 그는 뛰어난 일본어 능력을 발판 삼아 《일본어문전(日本語文典·Arte da Lingua de Iapam)》이라는 책을 집필하였다. 1604년부터 1608년에 걸쳐 나가사키학림(學林·교회의 부속 학교)에서 출간된 동 책자는 형태론, 품사론, 문장·호칭론의 3부로 나뉘어 라틴어 문법을 기초로 분석한 일본어의 구조, 문법, 발음, 구어와 문어의 차이, 각종 문서의 작성법, 경어법, 방언 등 일본어에 대한 체계적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1620년에는 동 책자의 문법 부분을 축약·정리하는 한편, 신철자(표기)법과 인명(人名)·호칭론 등의 내용이 추가된 《일본어소문전(日本語小文典·Arte Breve da Lingoa Iapoa)》이 마카오에서 출간되었다. 이들은 서양 어학의 관점에서 최초로 일본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념비적인 연구서로 언어학사(史)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로드리게즈는 만년에 예수회 본부의 요청으로 《일본교회사·Historia da Igreja de Iapam)》를 집필한다. 비록 출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남겨진 사본을 통해 밝혀진 그의 일본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이해는 놀라운 것이었다. 로드리게즈 이전에도 프로이스나 발리냐노 등에 의해 일본의 역사와 문화가 기술된 바 있지만, 로드리게즈는 적응주의에 의해 철저한 현지화 교육을 받은 사제답게 일본 포교의 선결 과제로서 ‘일본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여 언어·역사·문화·자연·지리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세밀한 분석을 통해 기존 기술과는 격이 다른 일본론을 전개하고 있다. 한 지역의 총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다루는 이러한 접근은 근대의 ‘지역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17세기 초에 이미 근대적 방법론에 필적하는 분류와 접근법이 엿보이는 그의 각종 저술은 그가 서구의 ‘일본학’(Japanology) 연구의 선구자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활약
한 편의 대하(大河)드라마와도 같은 로드리게즈의 인생 역정은 일본이 끝이 아니었다. 일본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무대를 바꿔 계속된다. 새로운 무대는 중국이었다. 당시 예수회는 중국 선교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1579년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신부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이후 특유의 적응주의를 통해 착실하게 교세를 확장하고 있었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 의복을 입고 중국인의 전통과 습관에 따라 생활하며 중국인들이 이방인의 기묘한 사상에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였다. 문화적 자존심이 높은 중국 지식인들에게 그러한 접근법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는 해박한 과학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만력제(萬曆帝)의 신임을 얻어 명(明) 조정에서 활약하기도 하는 등 기독교가 중국 사회에 수용되는 데 큰 기여를 하다가 1610년 베이징에서 생을 마감한다.
마카오에 둥지를 튼 로드리게즈는 중국 선교를 위한 일종의 지역 연구 임무를 부여받고 1613년 중국으로 향한다. 남부 해안지역을 거쳐 내륙에 이르는 광대한 중국 땅을 답사한 로드리게즈는 그때까지 중국에서 사용되던 카테키즘(Catechism·기독교 교리서)에 천주(天主)·상제(上帝)·천신(天神) 등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용어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한다.
일본 예수회의 카테키즘은 라틴어 ‘데우스’(Deus)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로드리게즈는 천주·상제 등의 용어가 유교나 도교 사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들어 번역어가 아닌 원어(原語)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장 존경받는 선현인 마테오 리치의 손길이 닿은 교리서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중국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제들이 로드리게즈의 비판에 동조하면서 이 문제는 로마에까지 전해졌고, 기독교계 내부에서 ‘전례(典禮)문제’의 하나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뛰어난 한자 실력을 바탕으로 중국어까지 섭렵한 로드리게즈는 중국에서도 통역사로 활동하게 된다. 마침 중국에서는 후금(後金)의 발흥으로 정세에 일대 격변이 발생하고 있었다. 명은 마카오 조차(租借) 이후 포르투갈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상인들에 의한 비공식 교역이 활발한 가운데 명의 관리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그들이 홍이포(紅夷炮)라 부르던 서양의 대포였다. 후금의 홍타이지가 장성을 돌파하여 베이징을 위협하는 등 후금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명 조정은 마카오 주둔 포르투갈군에게 포병 원군을 요청한다. 서광계(徐光啓) 등 명 조야에 퍼진 기독교 개종 관료와 학자들의 요청으로 예수회가 파병을 막후에서 교섭하였고, 명과의 관계 강화를 바라던 포르투갈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1629년 포대장 테세이라 코레아(Teixeira Corrêa)의 지휘하에 10문의 대포와 각종 화기로 무장한 200명의 포르투갈군이 베이징 방어를 위해 장도에 오른다. 이때 로드리게즈는 70세의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종군(從軍) 사제 겸 통역사로 동행한다. 1630년 테세이라 포대가 갖은 고생 끝에 베이징 턱밑의 허베이(河北)성 줘저우(涿州)에 도달했을 무렵, 수도(首都)에 무장 기독교도를 들이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 조정의 변심으로 산둥성 덩저우(登州, 지금의 옌타이·烟台시 펑라이·蓬莱)로 갑작스럽게 주둔지를 옮기게 된다.
정두원과의 만남
덩저우 순무(巡撫·지역책임자) 손원화(孫元化)는 서광계의 제자이자 기독교도로, 스승과 마찬가지로 만주족 격퇴에 서양의 우수한 문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생각의 소유자였다. 명군에 유럽 대포의 사용법과 전술을 전수하며 출병 명령을 대기하던 1631년 봄, 명나라에 파견되었던 조선의 진위사(陳慰使, 중국 황실에 상고·喪故가 있을 때 임시로 파견하던 조문사·弔問使) 정두원(鄭斗源)이 덩저우를 방문한다. 조선의 사신들은 여느 때 같으면 베이징에서 회령으로 넘어가는 여로를 택했겠지만, 당시는 후금의 발흥으로 육로가 막혀 뱃길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손원화의 소개로 조선의 사절을 만난 로드리게즈는 그들에게 조선 국왕에게 바치는 선물이라며 천리경(망원경)·자명종(기계식 추시계) 등의 서양 물품과 《직방외기》 《천문략》 《홍이포제본》 등 서양문물을 다룬 서적과 지도를 증정하였다. 《인조실록》에 육약한(陸若漢)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조앙 로드리게즈이다.
실록에 따르면 인조가 “육약한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묻자, 정두원이 “도를 터득한 사람(得道之人)인 듯하였습니다”라고 아뢴다. 일본과 중국을 안방처럼 누비며 격동의 역사적 현장에 증인으로 입회하였던 로드리게즈가 드디어 조선과도 인연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가 생을 마감하기 3년 전의 일이었다.⊙
로드리게즈 신부는 소년 시절 일본에 건너와 30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며, 일본의 언어・생활・문화를 체화하여 가장 현지화된 사제로 일본의 조야(朝野)를 누빈 인물이다. 로드리게즈 신부는 동(同)시대 중국에서 활약한 동명이인 ‘조앙 지랑 로드리게즈’(João Girão Rodrigues) 신부와 구별하기 위해 ‘조앙 츠주 로드리게즈’(João Tçuzu Rodrigues)로 불린다. ‘츠주’(Tçuzu)는 이름이 아니라 일종의 수식어로, 일본어 통사(通事, 일본어 발음 ‘츠지’)에서 온 말이다. 통사는 오늘날로 치면 통역사이다. 통사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그의 일본어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었고, 그는 뛰어난 일본어 능력을 바탕으로 후세에 길이 남을 체계적 일본어 연구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17살 때 일본에 건너와
1577년(1576년이라는 기록도 있다) 로드리게즈 신부가 일본에 건너왔을 때 그는 17세에 불과한 소년이었다. 포르투갈의 바이라(Beira) 지방 출신인 그가 어떠한 경로로 어린 나이에 일본에 오게 되었는지는 기록이 없다. 당시 15세 전후의 나이에 뱃사람이 되어 무역선을 타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었기에, 그 역시 돈벌이를 위해 동방 무역선의 선원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수회 측의 기록에 따르면 로드리게즈는 1574년 포르투갈을 떠나 인도 고아, 마카오를 거쳐 규슈의 분고(豊後, 지금의 오이타·大分현)에 도착하여 일본 생활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분고의 영주인 오토모 소린(大友宗麟)은 개종(改宗)에 반대하는 아내와 이혼을 불사하면서까지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대표적 ‘기리시탄 다이묘’였다. 당시 분고 일대에는 오토모의 후원하에 예수회가 포교 기반 확대를 위해 콜레지오(고등신학교), 노비시아테(예비 수련원) 등의 신학교들을 속속 설립하고 있었다.
로드리게즈는 20세가 되던 1580년, 예수회의 일원이 되어 이들 신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당시 일본에 설치된 신학교는 발리냐노의 발안(發案)으로 ‘적응주의’ 교육방침을 채택하고 있었다. 적응주의란 비(非)기독교 지역 포교 시 현지의 언어・문화・습관을 철저히 익힌 후, 그 바탕 위에 현지인들이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선교에 나선다는 발상이다. 그를 위해서는 현지에서 사제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긴요하였고, 이들 교육기관에서는 신학·철학·자연과학· 라틴어 등의 기본 과목에 대한 교수(敎授) 외에 현지의 언어·역사·문화 습득을 통한 현지화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분고 일대의 신학교에서는 발리냐노가 스스로 교편을 잡으며 사제들의 현지화를 독려하였고, 기독교로 개종한 일본의 유식자(有識者)들이 일본의 언어·역사·문화의 길라잡이기 되어 주었다.
유럽인과 일본인이 뒤섞여 체계적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로드리게즈의 학식은 일취월장한다. 특히 로드리게즈의 일본어는 성인이 되어 일본어를 습득하기 시작한 여타 사제들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최상급 수준이었다. 일본의 역사·고전·문화 지식을 바탕으로 고사(古事) 인용과 한자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그의 일본어 능력은 일본인들도 깜짝 놀랄 수준이었다고 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로드리게즈
 |
| 로드리게즈를 총애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
이때 발리냐노의 통역사로 로드리게즈가 발탁된다. 그 전까지는 자타 공인 최고의 일본 전문가 프로이스가 통역을 맡았으나, 노쇠한 프로이스를 대신하여 로드리게즈가 중책을 부여받은 것이다. 발리냐노가 1년을 기다려 성사된 히데요시와의 만남에서 통역을 맡은 로드리게즈는 일본인 뺨치는 유려한 일본어로 히데요시를 매료시킨다. 로드리게즈의 유창한 일본어에 감탄한 히데요시가 로드리게즈를 따로 불러 단독 면담을 가질 정도였다. 이때 시작된 히데요시와 로드리게즈의 인연은 히데요시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이어진다.
히데요시의 기독교 탄압 움직임에 숨을 죽이며 수면하에서 활동해야 했던 예수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 인도 부왕 사절 자격으로 히데요시의 일본 통일 위업을 경하(慶賀)하고 성대한 선물을 봉정(奉呈)하며 히데요시의 환심을 사는 한편, 포르투갈 무역 이권을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삼아 추방령을 철회하고 운신의 폭을 넓히려 했다. 그러한 일련의 교섭 활동에 로드리게즈가 깊숙이 개입하게 된 것이다.
히데요시는 만년(晩年)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사제들을 스페인·포르투갈 제국의 일본 침략 도구로 의심하며 경원시하였으나, 로드리게즈만은 예외로 후대하며 가까이 두었다. 그러나 로드리게즈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히데요시의 기독교 세력에 대한 의심은 누그러질 줄 몰랐고, 오히려 1597년 2월 나가사키의 ‘26 성인(聖人) 순교사건’으로 기독교인에 대해 극형을 불사하는 가혹한 박해가 본격화된다.
1598년 9월 히데요시는 교토의 후시미(伏見)성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한다. 히데요시는 숨을 거두기 며칠 전 로드리게즈를 거소로 따로 불러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한다. 로드리게즈는 죽음을 눈앞에 둔 속세의 권력자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을 권했으나, 히데요시는 묵묵부답인 채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진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무역 대리인 역할
 |
| 로드리게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무역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
당시 예수회 일본교구의 재정은 만성적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히데요시의 조선 침공과 그의 사후 권력투쟁 과정에서 포르투갈 무역선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다. 재정난에 고심하던 로드리게즈는 권력 쟁패에 나선 유력자들에게 포르투갈 무역 이권을 연계시키는 중개역을 통해 재정난을 타개하고자 했다. 일본 사정에 정통한 로드리게즈는 천하통일에 다가선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와 돈독한 관계를 맺는 데 주력한다.
이에야스와 로드리게즈는 1593년 규슈의 나고야(名護屋)성에서 이미 만난 적이 있는 사이였다. 이에야스는 당시 유창한 일본어로 기독교 교리를 불교 교리에 빗대어 설명하는 이국인 신부를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은 후, 이에야스의 지우(知遇)를 얻은 로드리게즈는 쇼군의 실질적 무역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당시 가장 중요한 교역품은 생사(生絲)였다. 로드리게즈는 생사 수급 과정에서 가격・물량・판매처 결정 등에 깊숙이 간여하게 되면서 쇼군·다이묘·일본 상인·포르투갈 상인의 이익이 교차하는 4파 구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로마와 고아의 예수회 상부는 상부대로 무역 이권(利權)에 개입하는 것은 성행(聖行)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로드리게즈의 처사에 비판적이었고, 라이벌 관계에 있는 프란체스코회 사제들은 더욱 직접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로드리게즈로서는 고립무원,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황이었다.
추방
결국 ‘마드레 데 데우스 사건(《월간조선》 11월호 〈‘노싸 세뇨라 다 그라사’호 폭침사건〉)’이 화근이 되어 로드리게즈의 신변에 큰 변화가 발생한다. 데우스호 사건에 관한 대부분의 정황은 사실 예수회가 남긴 기록으로 파악된 것이다. 그러나 어인 일인지 일본 기록에는 있는 데우스호와 관련된 로드리게즈의 기록이 예수회 기록에는 언급이 없다. 이를테면 로드리게즈가 데우스호와 일본측 간의 생사 거래 중개역을 맡은 사정이나, 그가 이에야스 알현을 위해 슨푸(駿府)를 방문한 데우스호 사절을 인솔한 사실 등이 예수회 기록에는 누락된 것이다.
데우스호 사건이 발생한 1610년 로드리게즈는 돌연 마카오로 추방된다. 이에야스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던 로드리게즈가 어떠한 이유로 추방을 당했는지 명확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없다. 훗날 예수회 사제 비에이라(Francisco Vieira)가 작성한 보고서 중에 “로드리게즈 신부는 일본 권력 중추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가사키의 무역과 내부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실수를 저지름으로써 많은 적을 만들었고, 끝내 그 적들의 부당한 박해에 의해 일본을 떠나야만 했다”는 언급 정도가 남아 있을 뿐이다.
역사가들의 해석은 두 갈래로 나뉜다. 로드리게즈에 의해 이권을 위협받은 나가사키 부교 하세가와(長谷川) 등이 로드리게즈를 데우스호 사건의 책임자로 무고(誣告)하여 이에야스의 눈밖에 나게 되었다는 해석과, 반대로 로드리게즈가 실제 이에야스의 이익보다 포르투갈과 예수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부정직한 중개를 하는 정황이 발각되어 이에야스의 노여움을 샀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진실이 무엇이든, 당시 이에야스는 주인선(朱印船) 무역과 아울러 스페인·네덜란드·영국 등 생사 대체 공급원 확보에 자신감을 갖고 포르투갈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교역 주도권을 쥐고자 하던 차였다. 안팎이 적으로 둘러싸인 로드리게즈는 언제든지 상황 변화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처지였다. 그러잖아도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던 예수회 일본교구는 가장 든든한 현지 권력자와의 연결고리인 로드리게즈를 잃게 됨으로써 급속하게 일본 내에서의 영향력이 쇠퇴한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영국의 윌리엄 애덤스와 네덜란드의 얀 요스텐 등 신교(新敎)국가 출신 유럽인들이었다.
‘日本學’ 연구의 선구자
무역 이권 개입 의혹으로 불운의 추방을 당한 사정과 별개로, 로드리게즈가 일본 활동을 통해 남긴 가장 큰 업적은 그의 뛰어난 지적 능력이 돋보이는 ‘일본학’ 연구이다. 그는 뛰어난 일본어 능력을 발판 삼아 《일본어문전(日本語文典·Arte da Lingua de Iapam)》이라는 책을 집필하였다. 1604년부터 1608년에 걸쳐 나가사키학림(學林·교회의 부속 학교)에서 출간된 동 책자는 형태론, 품사론, 문장·호칭론의 3부로 나뉘어 라틴어 문법을 기초로 분석한 일본어의 구조, 문법, 발음, 구어와 문어의 차이, 각종 문서의 작성법, 경어법, 방언 등 일본어에 대한 체계적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1620년에는 동 책자의 문법 부분을 축약·정리하는 한편, 신철자(표기)법과 인명(人名)·호칭론 등의 내용이 추가된 《일본어소문전(日本語小文典·Arte Breve da Lingoa Iapoa)》이 마카오에서 출간되었다. 이들은 서양 어학의 관점에서 최초로 일본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념비적인 연구서로 언어학사(史)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로드리게즈는 만년에 예수회 본부의 요청으로 《일본교회사·Historia da Igreja de Iapam)》를 집필한다. 비록 출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남겨진 사본을 통해 밝혀진 그의 일본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이해는 놀라운 것이었다. 로드리게즈 이전에도 프로이스나 발리냐노 등에 의해 일본의 역사와 문화가 기술된 바 있지만, 로드리게즈는 적응주의에 의해 철저한 현지화 교육을 받은 사제답게 일본 포교의 선결 과제로서 ‘일본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여 언어·역사·문화·자연·지리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세밀한 분석을 통해 기존 기술과는 격이 다른 일본론을 전개하고 있다. 한 지역의 총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다루는 이러한 접근은 근대의 ‘지역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17세기 초에 이미 근대적 방법론에 필적하는 분류와 접근법이 엿보이는 그의 각종 저술은 그가 서구의 ‘일본학’(Japanology) 연구의 선구자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활약
 |
| 마테오 리치(왼쪽)와 서광계. |
1579년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신부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이후 특유의 적응주의를 통해 착실하게 교세를 확장하고 있었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 의복을 입고 중국인의 전통과 습관에 따라 생활하며 중국인들이 이방인의 기묘한 사상에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였다. 문화적 자존심이 높은 중국 지식인들에게 그러한 접근법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는 해박한 과학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만력제(萬曆帝)의 신임을 얻어 명(明) 조정에서 활약하기도 하는 등 기독교가 중국 사회에 수용되는 데 큰 기여를 하다가 1610년 베이징에서 생을 마감한다.
마카오에 둥지를 튼 로드리게즈는 중국 선교를 위한 일종의 지역 연구 임무를 부여받고 1613년 중국으로 향한다. 남부 해안지역을 거쳐 내륙에 이르는 광대한 중국 땅을 답사한 로드리게즈는 그때까지 중국에서 사용되던 카테키즘(Catechism·기독교 교리서)에 천주(天主)·상제(上帝)·천신(天神) 등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용어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한다.
일본 예수회의 카테키즘은 라틴어 ‘데우스’(Deus)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로드리게즈는 천주·상제 등의 용어가 유교나 도교 사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들어 번역어가 아닌 원어(原語)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장 존경받는 선현인 마테오 리치의 손길이 닿은 교리서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중국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제들이 로드리게즈의 비판에 동조하면서 이 문제는 로마에까지 전해졌고, 기독교계 내부에서 ‘전례(典禮)문제’의 하나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뛰어난 한자 실력을 바탕으로 중국어까지 섭렵한 로드리게즈는 중국에서도 통역사로 활동하게 된다. 마침 중국에서는 후금(後金)의 발흥으로 정세에 일대 격변이 발생하고 있었다. 명은 마카오 조차(租借) 이후 포르투갈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상인들에 의한 비공식 교역이 활발한 가운데 명의 관리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그들이 홍이포(紅夷炮)라 부르던 서양의 대포였다. 후금의 홍타이지가 장성을 돌파하여 베이징을 위협하는 등 후금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명 조정은 마카오 주둔 포르투갈군에게 포병 원군을 요청한다. 서광계(徐光啓) 등 명 조야에 퍼진 기독교 개종 관료와 학자들의 요청으로 예수회가 파병을 막후에서 교섭하였고, 명과의 관계 강화를 바라던 포르투갈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1629년 포대장 테세이라 코레아(Teixeira Corrêa)의 지휘하에 10문의 대포와 각종 화기로 무장한 200명의 포르투갈군이 베이징 방어를 위해 장도에 오른다. 이때 로드리게즈는 70세의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종군(從軍) 사제 겸 통역사로 동행한다. 1630년 테세이라 포대가 갖은 고생 끝에 베이징 턱밑의 허베이(河北)성 줘저우(涿州)에 도달했을 무렵, 수도(首都)에 무장 기독교도를 들이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 조정의 변심으로 산둥성 덩저우(登州, 지금의 옌타이·烟台시 펑라이·蓬莱)로 갑작스럽게 주둔지를 옮기게 된다.
정두원과의 만남
덩저우 순무(巡撫·지역책임자) 손원화(孫元化)는 서광계의 제자이자 기독교도로, 스승과 마찬가지로 만주족 격퇴에 서양의 우수한 문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생각의 소유자였다. 명군에 유럽 대포의 사용법과 전술을 전수하며 출병 명령을 대기하던 1631년 봄, 명나라에 파견되었던 조선의 진위사(陳慰使, 중국 황실에 상고·喪故가 있을 때 임시로 파견하던 조문사·弔問使) 정두원(鄭斗源)이 덩저우를 방문한다. 조선의 사신들은 여느 때 같으면 베이징에서 회령으로 넘어가는 여로를 택했겠지만, 당시는 후금의 발흥으로 육로가 막혀 뱃길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손원화의 소개로 조선의 사절을 만난 로드리게즈는 그들에게 조선 국왕에게 바치는 선물이라며 천리경(망원경)·자명종(기계식 추시계) 등의 서양 물품과 《직방외기》 《천문략》 《홍이포제본》 등 서양문물을 다룬 서적과 지도를 증정하였다. 《인조실록》에 육약한(陸若漢)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조앙 로드리게즈이다.
실록에 따르면 인조가 “육약한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묻자, 정두원이 “도를 터득한 사람(得道之人)인 듯하였습니다”라고 아뢴다. 일본과 중국을 안방처럼 누비며 격동의 역사적 현장에 증인으로 입회하였던 로드리게즈가 드디어 조선과도 인연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가 생을 마감하기 3년 전의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