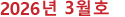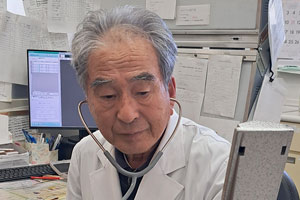⊙ 수술일자 결정부터 퇴원 시까지 단계마다 ‘보건일꾼’들에게 뇌물
⊙ 환자 가족, 간호사가 알려주는 대로 암시장에서 필요한 의약품 구입
⊙ 주사기는 물론, 심지어 피고름이 묻은 붕대까지 모든 의료용품 ‘재활용’
⊙ 환자 가족, 간호사가 알려주는 대로 암시장에서 필요한 의약품 구입
⊙ 주사기는 물론, 심지어 피고름이 묻은 붕대까지 모든 의료용품 ‘재활용’

- 평양의 한 종합진료소에서 신형독감(신종플루) 예방검진을 하는 모습. 북한 의료시설들은 만성적인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조선DB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이 있다. 전기와 수도다. 북한에서는 하루 전기 들어오는 시간이 3시간 미만이다. 그것도 사정이 좋은 날에 한해서다. 명절 때는 전기 공급이 다소 늘어나는데, 이를 ‘배려 전기’라고 한다. 수돗물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공동 우물을 파든 강에서 길어다 먹든 대부분 생활용수는 자체 조달해야 한다. 평양 시내 20층 아파트 거주자인 경우 매일 물지게를 지고 20층까지 몇 차례 오르내려야 한다. 이런 사정이 만연하기에 물 한 컵으로 세수·양치질·빨래·용변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물 아껴 쓰는 요령’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제작·방송된 적도 있다.
그동안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남한의 ‘전기와 수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은 놀라움 자체다. 배정 주택 입주 첫날에, 24시간 전기 들어오는 것이 신기해서 밤새 불을 켜고 잠들었다는 사람도 있다. 정말로 전기가 끊어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수도꼭지만 틀면 찬물뿐 아니라 더운물까지 콸콸 나오기에, ‘탈북자라고 나만 배려해서 더운물을 쏴주나’ 했다는 사람도 있다.
北 모성사망률, 南의 8배
탈북민들이 더욱 놀라는 것은 병원에 다녀와서다. 먼저 시설이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의약품이 넘쳐나서 놀란다. 무엇보다 주사기 등 각종 의료용품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한번 수술받고 나면 남한에 오기 잘했다는 생각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한없이 커진다. 완전히 망가진 북한의 의료현실과 남한의 시스템이 곧바로 비교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의료체계는 사실상 붕괴했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벌어진 일이다. 그 후로 20여 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일로다.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에 따르면, 북한의 모성(母性)사망률이 신생아 10만명당 82명에 달해 남한의 11명보다 8배가량 높다고 한다. 2008년 10만명당 77.2명에서 더 높아진 수치다. 모성사망률은 임신이나 출산 직후 관련된 질병으로 여성이 사망하는 비율을 말한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17 세계인구현황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공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 네트워크 구조와 발전 방안〉 보고서에 나온 통계다.
최근 평양의 병원을 방문한 한 인사의 목격담도 충격적이다. 보훈을 위한 병원으로 북한이 그래도 신경을 쓰는 곳이다. 그럼에도 그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병이 일제 맥주병이었다. 사정을 알아보니 일제 맥주병이 북한산 수액병에 비해 유리가 훨씬 더 강하고 위생적이어서 끓는 물에 소독해 다시 사용하는 것이다. 철제 침대는 대부분 칠이 많이 벗겨지고 녹슬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었다.
외국에서 보내준 고가(高價)의 의료장비도 ‘놀고’ 있었다. 북한 의료진은 “장비를 다루는 교육의 부재(不在)와 전기 문제가 겹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北 의사들이 먹고사는 법
2017년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탈출해 귀순한 북한 경비병 오청성씨 경우도 북한 의료 수준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아주대병원에서 오씨의 총상을 치료할 때 27cm에 달하는 기생충이 나왔다. 남한에서는 구충제 몇 알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핵심계층의 자제들만 고르고 골라 배치하며 식생활 등 처우가 좋다는 JSA 병사가 이 정도라면 119만 북한군 병사나 일반 주민의 상태는 어떨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영화 〈크로싱〉에서 주인공이 탈북한 이유는 아내의 결핵약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에선 결핵약을 구하기 위해 온갖 고초를 겪지만, 남한에선 보건소에 가면 결핵약을 무료로 나눠준다.
이영종 소장에 따르면, 북한 의료보건정책의 특성은 크게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 고려의학(한의학) 중시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북한의 만성적 경제난이 만난의 근원이다. 의약품과 의료장비는 많이 모자라고, 방역체계를 갖출 수 없어 환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북한에서는 일단 병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교통수단도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생기면 가족들은 달구지든 자전거든 온갖 수단을 동원해 병원에 도착한다.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일단 수술 날짜와 시각을 잡기 위해 의료진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북한은 ‘보건일꾼(의사)’들에게 도덕성과 희생을 요구한다. 하지만 대우는 일반 노동자와 큰 차이가 없다. 공산주의에서는 노동의 품질이나 전문성보다 ‘노동에 들어간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순 일용직의 한 시간과 의사의 한 시간은 같은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북한의 의사는 노동강도에 비해 수입이 형편없는 3D 업종이다. 그렇다고 장마당 장사를 할 수도 없다. 공장 노동자들은 관리자에게 뇌물을 주고 출근한 것으로 한 뒤 다른 일을 볼 수도 있지만, 보건일꾼들은 자리를 지켜야 한다. 수술실이 쉽게 옮길 수 있는 물건도 아니니 ‘개인영업’을 할 수도 없다. 월급만 가지고는 쌀 몇 kg밖에 살 수 없다.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병원 내부에서 거래를 한다. 먼저, 환자들의 입·퇴원을 결정하면서 뒷돈을 받는다. 환자 가족은 수술 날짜가 잡히면 보건일꾼들을 따로 불러 푸짐하게 한 상 대접하고, 수술 후 인사로 담배나 술 등을 별도로 챙겨주는 것이 북한 사회의 상식이다.
각종 진단서 발급도 돈벌이 수단이다. 진단서는 군대나 노동단련대에서 합법적으로 쉬운 보직을 받을 수 있는 ‘마법의 종이’다. 회사 간부에게 돈을 바치느니 진단서를 받아 합법적으로 결근하는 것이 더 낫다는 노동자들도 많다.
의사와 암시장 결탁
병원에는 의약품이 없다. 당국에서 배급한 의약품을 밀반출해 보건일꾼 개개인이 수입을 올리는 것은 비밀도 아니다. 어차피 당국이 배급하는 의약품은 기초적인 물품이며 수량도 적다.
환자들도 병원에 자신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수술 날짜가 잡히면 간호사들이 가족에게 수술 전후에 필요한 의약품, 수술 중에 필요한 의약품을 적은 쪽지를 준다. 만일에 대비해 필요한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주문하지만, 환자 가족 처지에서는 전문지식이 없어 모르기도 하고, 설령 안다고 해도 따질 수 없다. 마취약이 없다는데,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데, 환자의 고통이 어떨지 뻔히 알면서 보건일꾼들에게 대들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보건일꾼들은 어디 어디로 찾아가면 파는 곳이 있다며 주소를 알려준다. 당국을 통해서는 구하려야 구할 수 없는 약품이라는 걸 보건일꾼들도 알고 환자 가족도 안다. 오히려 환자 가족은 이런 방법으로라도 필요한 약품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암시장의 의료품 판매상은 판매이익을 보건일꾼들과 나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북한에서는 의사들이 수술 전날 가족에게 반드시 하는 말이 있다. “수술 도중 전기가 끊어질 수 있으니 그 점을 미리 알고 계시라.” 그래서 환자 가족은 수술시간이 잡히면 또 뇌물을 들고 변전소(變電所)를 찾아간다. 수술하는 동안 수술실 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손을 써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천신만고 끝에 수술을 마치면 그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보건일꾼들을 모셔야 한다. 주요 약품이 없어 수술 후 환자 사망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주사기는 물론 심지어 피고름이 묻은 붕대까지, 모든 의료용품을 ‘재활용’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살아나오기 위해선 수술 후에도 수술 전 못지않은 온갖 정성이 필요하다. 겨울에는 난방도 문제다. 북한 병실 가운데는 실내온도가 영하인 곳이 부지기수다. 여유가 있다면 병실뿐 아니라 보건일꾼들의 사무실 난방도 환자 가족이 신경 써야 한다.
이것이 탈북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전하는, 북한 당국이 자랑하는 ‘무상(無償)의료제’의 민얼굴이다.⊙
그동안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남한의 ‘전기와 수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은 놀라움 자체다. 배정 주택 입주 첫날에, 24시간 전기 들어오는 것이 신기해서 밤새 불을 켜고 잠들었다는 사람도 있다. 정말로 전기가 끊어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수도꼭지만 틀면 찬물뿐 아니라 더운물까지 콸콸 나오기에, ‘탈북자라고 나만 배려해서 더운물을 쏴주나’ 했다는 사람도 있다.
北 모성사망률, 南의 8배
탈북민들이 더욱 놀라는 것은 병원에 다녀와서다. 먼저 시설이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의약품이 넘쳐나서 놀란다. 무엇보다 주사기 등 각종 의료용품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한번 수술받고 나면 남한에 오기 잘했다는 생각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한없이 커진다. 완전히 망가진 북한의 의료현실과 남한의 시스템이 곧바로 비교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의료체계는 사실상 붕괴했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벌어진 일이다. 그 후로 20여 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일로다.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에 따르면, 북한의 모성(母性)사망률이 신생아 10만명당 82명에 달해 남한의 11명보다 8배가량 높다고 한다. 2008년 10만명당 77.2명에서 더 높아진 수치다. 모성사망률은 임신이나 출산 직후 관련된 질병으로 여성이 사망하는 비율을 말한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17 세계인구현황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공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 네트워크 구조와 발전 방안〉 보고서에 나온 통계다.
최근 평양의 병원을 방문한 한 인사의 목격담도 충격적이다. 보훈을 위한 병원으로 북한이 그래도 신경을 쓰는 곳이다. 그럼에도 그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병이 일제 맥주병이었다. 사정을 알아보니 일제 맥주병이 북한산 수액병에 비해 유리가 훨씬 더 강하고 위생적이어서 끓는 물에 소독해 다시 사용하는 것이다. 철제 침대는 대부분 칠이 많이 벗겨지고 녹슬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었다.
외국에서 보내준 고가(高價)의 의료장비도 ‘놀고’ 있었다. 북한 의료진은 “장비를 다루는 교육의 부재(不在)와 전기 문제가 겹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北 의사들이 먹고사는 법
2017년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탈출해 귀순한 북한 경비병 오청성씨 경우도 북한 의료 수준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아주대병원에서 오씨의 총상을 치료할 때 27cm에 달하는 기생충이 나왔다. 남한에서는 구충제 몇 알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핵심계층의 자제들만 고르고 골라 배치하며 식생활 등 처우가 좋다는 JSA 병사가 이 정도라면 119만 북한군 병사나 일반 주민의 상태는 어떨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영화 〈크로싱〉에서 주인공이 탈북한 이유는 아내의 결핵약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에선 결핵약을 구하기 위해 온갖 고초를 겪지만, 남한에선 보건소에 가면 결핵약을 무료로 나눠준다.
이영종 소장에 따르면, 북한 의료보건정책의 특성은 크게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 고려의학(한의학) 중시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북한의 만성적 경제난이 만난의 근원이다. 의약품과 의료장비는 많이 모자라고, 방역체계를 갖출 수 없어 환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북한에서는 일단 병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교통수단도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생기면 가족들은 달구지든 자전거든 온갖 수단을 동원해 병원에 도착한다.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일단 수술 날짜와 시각을 잡기 위해 의료진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북한은 ‘보건일꾼(의사)’들에게 도덕성과 희생을 요구한다. 하지만 대우는 일반 노동자와 큰 차이가 없다. 공산주의에서는 노동의 품질이나 전문성보다 ‘노동에 들어간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순 일용직의 한 시간과 의사의 한 시간은 같은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북한의 의사는 노동강도에 비해 수입이 형편없는 3D 업종이다. 그렇다고 장마당 장사를 할 수도 없다. 공장 노동자들은 관리자에게 뇌물을 주고 출근한 것으로 한 뒤 다른 일을 볼 수도 있지만, 보건일꾼들은 자리를 지켜야 한다. 수술실이 쉽게 옮길 수 있는 물건도 아니니 ‘개인영업’을 할 수도 없다. 월급만 가지고는 쌀 몇 kg밖에 살 수 없다.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병원 내부에서 거래를 한다. 먼저, 환자들의 입·퇴원을 결정하면서 뒷돈을 받는다. 환자 가족은 수술 날짜가 잡히면 보건일꾼들을 따로 불러 푸짐하게 한 상 대접하고, 수술 후 인사로 담배나 술 등을 별도로 챙겨주는 것이 북한 사회의 상식이다.
각종 진단서 발급도 돈벌이 수단이다. 진단서는 군대나 노동단련대에서 합법적으로 쉬운 보직을 받을 수 있는 ‘마법의 종이’다. 회사 간부에게 돈을 바치느니 진단서를 받아 합법적으로 결근하는 것이 더 낫다는 노동자들도 많다.
의사와 암시장 결탁
병원에는 의약품이 없다. 당국에서 배급한 의약품을 밀반출해 보건일꾼 개개인이 수입을 올리는 것은 비밀도 아니다. 어차피 당국이 배급하는 의약품은 기초적인 물품이며 수량도 적다.
환자들도 병원에 자신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수술 날짜가 잡히면 간호사들이 가족에게 수술 전후에 필요한 의약품, 수술 중에 필요한 의약품을 적은 쪽지를 준다. 만일에 대비해 필요한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주문하지만, 환자 가족 처지에서는 전문지식이 없어 모르기도 하고, 설령 안다고 해도 따질 수 없다. 마취약이 없다는데,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데, 환자의 고통이 어떨지 뻔히 알면서 보건일꾼들에게 대들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보건일꾼들은 어디 어디로 찾아가면 파는 곳이 있다며 주소를 알려준다. 당국을 통해서는 구하려야 구할 수 없는 약품이라는 걸 보건일꾼들도 알고 환자 가족도 안다. 오히려 환자 가족은 이런 방법으로라도 필요한 약품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암시장의 의료품 판매상은 판매이익을 보건일꾼들과 나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북한에서는 의사들이 수술 전날 가족에게 반드시 하는 말이 있다. “수술 도중 전기가 끊어질 수 있으니 그 점을 미리 알고 계시라.” 그래서 환자 가족은 수술시간이 잡히면 또 뇌물을 들고 변전소(變電所)를 찾아간다. 수술하는 동안 수술실 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손을 써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천신만고 끝에 수술을 마치면 그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보건일꾼들을 모셔야 한다. 주요 약품이 없어 수술 후 환자 사망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주사기는 물론 심지어 피고름이 묻은 붕대까지, 모든 의료용품을 ‘재활용’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살아나오기 위해선 수술 후에도 수술 전 못지않은 온갖 정성이 필요하다. 겨울에는 난방도 문제다. 북한 병실 가운데는 실내온도가 영하인 곳이 부지기수다. 여유가 있다면 병실뿐 아니라 보건일꾼들의 사무실 난방도 환자 가족이 신경 써야 한다.
이것이 탈북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전하는, 북한 당국이 자랑하는 ‘무상(無償)의료제’의 민얼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