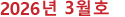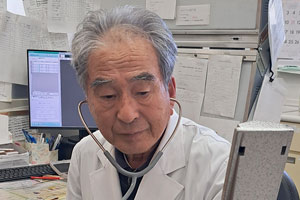문학평론가이자 국문학자인 영인문학관 강인숙 관장이 에세이집을 펴냈다. 정말 쓰고 싶을 때, 쓰고 싶은 양식으로 자유롭게 쓴 글을 묶었다. 길이도 다양하다. 아주 짧은 글도 있고 180매가 넘는 글도 있다. 책을 넘기다 남편(고 이어령 선생)에 대한 대목이 있어 눈길이 간다.
결혼을 하니 ‘뱃사공 과업’이 생각보다 버거웠다. 남자는 생계를 책임지고 여자는 노젓기를 하면 균형이 대충 맞는데,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덤으로 노까지 저어야 하니 짊어져야 할 부담이 너무 컸다.
남편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인물이어서 노를 저을 시간이 없었다. 무엇보다 일 욕심이 많아서 항상 바빴고 노상 시간에 쪼들렸다. 남편이 글을 쓰는 시간에 아이가 울면 업고 나가 밖에서 재워오는 식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과잉 충성을 했다.
집에서 남자가 해야 하는 잡무는 사람을 불러 대행시켰고, 아내의 일은 직접 하면서 남편이 일상적 잡무에서 멀어지게 했다. 그게 그 무렵 강인숙의 사랑법이었다.
그 와중에 강 관장이 무리를 해서 대학원에 들어간 것은 지적으로 퇴화해 가는 데 대한 위기감 때문이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정년 퇴임을 할 무렵이 되니 거짓말처럼 노 젓는 일이 쉬워졌다.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처럼 눈을 빛내며 퇴직 후의 한가함을 마음껏 누렸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질병들이 몰려왔다. 고혈압, 허리 디스크, 갑상선 기능항진, 골다공증, 난소종양, 인후암 등 참 많은 병이 차례차례 문을 두드렸다. 수시로 주사를 맞아야 했지만 해야 할 일을 미룬 적도 없으니 사람들은 그가 환자인 것을 잊었다. 이런 중 문득 뒤돌아 본, 항상 의욕이 넘치던, 발랄한 남편이 있던 비어 있는 그 자리에 ‘그 찬란하고 빛나던 시간들’이 그리워진다.⊙
결혼을 하니 ‘뱃사공 과업’이 생각보다 버거웠다. 남자는 생계를 책임지고 여자는 노젓기를 하면 균형이 대충 맞는데,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덤으로 노까지 저어야 하니 짊어져야 할 부담이 너무 컸다.
남편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인물이어서 노를 저을 시간이 없었다. 무엇보다 일 욕심이 많아서 항상 바빴고 노상 시간에 쪼들렸다. 남편이 글을 쓰는 시간에 아이가 울면 업고 나가 밖에서 재워오는 식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과잉 충성을 했다.
집에서 남자가 해야 하는 잡무는 사람을 불러 대행시켰고, 아내의 일은 직접 하면서 남편이 일상적 잡무에서 멀어지게 했다. 그게 그 무렵 강인숙의 사랑법이었다.
그 와중에 강 관장이 무리를 해서 대학원에 들어간 것은 지적으로 퇴화해 가는 데 대한 위기감 때문이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정년 퇴임을 할 무렵이 되니 거짓말처럼 노 젓는 일이 쉬워졌다.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처럼 눈을 빛내며 퇴직 후의 한가함을 마음껏 누렸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질병들이 몰려왔다. 고혈압, 허리 디스크, 갑상선 기능항진, 골다공증, 난소종양, 인후암 등 참 많은 병이 차례차례 문을 두드렸다. 수시로 주사를 맞아야 했지만 해야 할 일을 미룬 적도 없으니 사람들은 그가 환자인 것을 잊었다. 이런 중 문득 뒤돌아 본, 항상 의욕이 넘치던, 발랄한 남편이 있던 비어 있는 그 자리에 ‘그 찬란하고 빛나던 시간들’이 그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