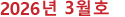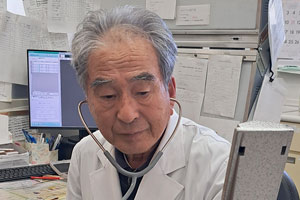1991년 소련이 붕괴했다. 이와 함께 냉전 시절 ‘동구 공산권’으로 불리던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은 자신들을 ‘중유럽’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빈곤, 낙후, 억압의 냄새가 나는 ‘동유럽’을 거부하고 선진적인 독일·오스트리아 문화권의 일부였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래서일까?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역사다. 동유럽 같은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도발적인 선언으로 책을 시작한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오스만 등 ‘제국’의 일부였고, 냉전과 함께 ‘동유럽’이라는 지정학적 개념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확실히 동유럽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자취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식인들에게 멸시받다가 결국은 민족 정체성의 상징이 된 여러 민족의 언어가 있었다. 언어보다 먼저 구심적 역할을 해온 종교가 있었다. 근대 국민국가의 국경을 넘나들면서 살았던 유랑시인이나 집시, 예언자들의 삶도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자는 체코니 폴란드니 루마니아니 하는 현대의 국경선에 구애받지 않는다. 대신 그런 국경선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그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신앙, 민담, 전설 등을 조곤조곤 이야기한다. 물론 그들이 어렵게 민족적 정체성을 발견하고 근대 독립국가를 만들어낸 후 분투해온 이야기들도 빼놓지 않는다. 저자는 폴란드 귀족의 피와 유대인의 피를 함께 물려받은 자기 집안 이야기들도 슬쩍슬쩍 끼워 넣는다. 역사에 대한 묵직하면서도 재미있는 에세이를 읽는 느낌을 넘어, 저자의 손에 이끌려 낯설지만 정겨운 땅을 여행하는 느낌마저 든다. 그리고 책장을 덮으면서는 이렇게 중얼거리게 된다. “굿바이, 동유럽!”⊙
그래서일까?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역사다. 동유럽 같은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도발적인 선언으로 책을 시작한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오스만 등 ‘제국’의 일부였고, 냉전과 함께 ‘동유럽’이라는 지정학적 개념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확실히 동유럽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자취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식인들에게 멸시받다가 결국은 민족 정체성의 상징이 된 여러 민족의 언어가 있었다. 언어보다 먼저 구심적 역할을 해온 종교가 있었다. 근대 국민국가의 국경을 넘나들면서 살았던 유랑시인이나 집시, 예언자들의 삶도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자는 체코니 폴란드니 루마니아니 하는 현대의 국경선에 구애받지 않는다. 대신 그런 국경선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그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신앙, 민담, 전설 등을 조곤조곤 이야기한다. 물론 그들이 어렵게 민족적 정체성을 발견하고 근대 독립국가를 만들어낸 후 분투해온 이야기들도 빼놓지 않는다. 저자는 폴란드 귀족의 피와 유대인의 피를 함께 물려받은 자기 집안 이야기들도 슬쩍슬쩍 끼워 넣는다. 역사에 대한 묵직하면서도 재미있는 에세이를 읽는 느낌을 넘어, 저자의 손에 이끌려 낯설지만 정겨운 땅을 여행하는 느낌마저 든다. 그리고 책장을 덮으면서는 이렇게 중얼거리게 된다. “굿바이, 동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