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과 중국, 타이완과 베트남, 포르투갈, 스페인 등 전 세계가 골머리
⊙ 2006년부터 재선충 세포를 관찰하다가 ‘천적’ 곰팡이균(Esteya) 발견
⊙ 재선충 감염되면 3~4주 후 100% 고사… 2016년 초 제주도 검증에서 감염목 20% 내외 살아나
성창근
1954년생. 충남대 식품공학과, 서울대 대학원, 미국 노스다코타주립대 대학원(생화학 박사) 졸업 /
현 충남대 식품공학과 교수, 고려인삼학회 부회장, 농림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자문위원
⊙ 2006년부터 재선충 세포를 관찰하다가 ‘천적’ 곰팡이균(Esteya) 발견
⊙ 재선충 감염되면 3~4주 후 100% 고사… 2016년 초 제주도 검증에서 감염목 20% 내외 살아나
성창근
1954년생. 충남대 식품공학과, 서울대 대학원, 미국 노스다코타주립대 대학원(생화학 박사) 졸업 /
현 충남대 식품공학과 교수, 고려인삼학회 부회장, 농림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자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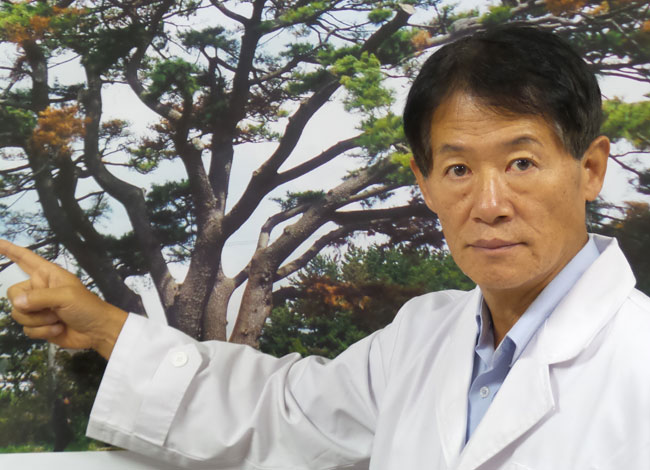
- 충남대 성창근 교수.
‘소나무 에이즈(AIDS)’라 불리는 재선충(材線蟲)은 무시무시하다. 1988년 이후 파죽지세로 번지고 있다. 방제비용으로 이미 1조원을 썼다지만 속수무책이다. 2013년부터 3년간 제주에서만 1500억원이 투입됐으나 소나무 150만 그루가 죽었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초록색의 솔잎이 연두색으로 변한다. 변색이 확인되면 3~4개월 이내에 거의 죽어 버린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아시아에선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타이완과 베트남 등지에서 발견됐고 유럽은 포르투갈·스페인, 북미에서는 미국·캐나다, 그리고 중남미의 온두라스 등지에서 감염사실이 학계에 보고됐다. 각국이 비상이다.
문제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다는 사실이다. 국내 예방·치료제는 없고 수입약품이 전부다. 산림청의 방제 매뉴얼이라는 것도 미봉책. ‘아바맥틴’이라 부르는 예방주사를 놓거나,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벌채해 태우는 것이 전부다. 태우지 않으면 톱밥으로 가공한다.
국내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이 2013년 4258ha, 2014년 1만3121ha, 2015년 1만4618ha, 올 들어 2만4173ha로 늘어났다. 재선충이 발견된 곳은 전국 98개 시·군·구. 국내 200만 그루 내외가 고사했고 피해액은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른다. 극심한 지역은 제주, 울산, 안동, 구미, 포항, 거제 등지다. 올해엔 세종, 금산, 영동, 전주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다만, 산림청은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가 줄고 있다고 주장한다. “올 4월 현재 감염목이 137만 그루로 작년 같은 기간에 발견된 174만 그루보다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줄어든 이유는 간단하다. 감염 나무가 확인되는 족족 베어내기 때문이다.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 주변 20m 이내 멀쩡한 나무까지 가차 없이 벤다. 겉으론 줄고 있다지만 산림청과 감염목이 있는 지자체는 속병을 앓고 있다. 방제예산을 편성하는 국회 농해수위 역시 답답하긴 마찬가지. 해마다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선도적인 연구결과나 원천기술이 확보됐다는 소식이 안 들린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의 말이다.
“(방제예산이 아닌) 연구개발비로 지난 2006년부터 124억원을 투입했어요. 특허 등록 8건, 특허 출원 21건, 논문 116편이 나왔으나 재선충 방제를 위한 약재개발 성과는 전무합니다. 목표가 분명한 실제 재선충을 방제하기 위한 연구보다는 겨우 피상적인 논문 쓰는 데 급급하고 논문 1편에 1억원의 연구비를 쓰고 있어요.”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134억4000만원의 재선충 연구비를 추가로 책정한 상태다. 그러나 국회 농해수위는 재선충 연구개발(R&D) 예산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나무 재선충의 ‘천적’ 찾아
그렇다고 아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자는 소나무 재선충을 연구하는 충남대 성창근(成昌根・62) 교수(식품생명공학과)를 만났다. 그는 국제특허 2건, 국내특허 28건을 출원한 과학자다. SCI급 논문이 181편에 이르고 재선충 관련 논문이 25편이지만 산림청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아직 그의 연구성과를 미덥지 않게 바라본다. 성 교수의 말이다.
“현재 정부의 재선충 방제방법이란게 답답합니다. 가을에 감염목과 그 주변 반경 20m 내의 나무를 ‘모두 베기’나 ‘일부 베기’로 전부 잘라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딱 맞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매년 봄에는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는 맹독성 농약을 살포합니다. 이런 방제가 무용지물인 것은 이미 재선충 방제를 거의 포기하고 있는 타이완이나 일본에서 해 왔던 방법들의 정확한 답습입니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소나무 재선충의 ‘천적(天敵)’을 찾아내 재선충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생물학계에 ‘천적’이란 먹이연쇄에서 잡아먹히는 동물에 대해 잡아먹는 동물을 일컫는다.
— 천적을요?
“네, 천적 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 잣나무 등에 기생해 나무를 갉아먹는 선충을 말합니다. 솔수염하늘소에 기생하며 다른 나무로 이동합니다. 저는 어떤 개체든 천적이 있다는 생각에 착안, 2006년부터 계속 세포를 관찰하다가 한국형 재선충 천적을 발견했어요.
이미 관련 논문 25편을 썼고 곧 《네이처》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재선충 천적 곰팡이는 소나무 조직 속에 숨어 있는 재선충을 찾아내 머리부터 집중 공격을 해서 수 시간에 재선충을 죽입니다.”
성 교수는 “수많은 실험연구, 경남 진주와 제주에서의 현장연구로 재선충 감염목을 살릴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수십 그루의 죽어 가던 변색된 소나무에서 푸른 잎이 다시 돋았다”고 했다.
“어쩌면 세계 처음으로 선충 감염목을 다시 살려낸 겁니다. 향후 어떻게 보완하고 적극 활용하느냐에 따라 재선충 감염 소나무를 완전히 살려낼 수 있다고 봅니다.”
성 교수가 재선충 천적에 관심을 갖게 된 사연은 이렇다. 2003년쯤 대구로 내려가는 길에 우연히 참외 재배로 유명한 경북 성주에 들렀다고 한다.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참외가 작고 잎이 시들시들하기에 농민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참외 뿌리선충’ 때문이란 얘기를 들었다. 아무리 농약을 쳐도 선충이 죽지 않고 내성만 키우더란 것이다.
대학 연구실로 돌아온 그는 참외에 해가 없고, 선충만 잡는 천연약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본초강목》 《동의보감》을 뒤졌다. 의서(醫書)에 소개된 3500여 가지 식물을 살피다가 계피나무 뿌리엔 선충이 기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곧바로 계피를 활용한 천연약제 개발에 착수했다. 성 교수의 말이다.
‘참외 뿌리선충’ 박멸 경험
“계피나무 뿌리에는 선충이 기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들짝 놀랐어요. 다시 성주로 내려가 참외 비닐하우스 200동을 샀죠. 계피 성분으로 약제를 만들어 참외에 뿌렸더니 누렇던 잎이 2~3주 만에 새파랗게 변했어요. 그렇게 재배된 참외가 기존 참외보다 5배 높은 유기농 참외로 현대백화점에 납품하게 됐어요.
그때 누군가가 그래요. 참외 뿌리선충도 잡았는데, 소나무 재선충 역시 치료제가 있을 거라고요. 당시 경북 청도가 재선충 감염으로 시름하고 있었어요. 청도에 내려가 계피를 링거에 넣어 재선충 감염목에 수간(樹幹)주사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링거에 송진이 차올라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는 실패를 거울삼아 본격적으로 재선충 치료에 뛰어들었다. “전 세계 재선충 방제약이 없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꼈다”고 했다.
“소나무 묘목 1000그루를 사서 비슷한 실험을 계속하는데 그때 머릿속에 신기한 것이 지나가더군요. 생물학계에선 천적이 중요해요. 쥐가 아무리 잘나도 고양이를 못 이기듯, 진딧물에 대한 무당벌레, 메뚜기와 사마귀 사이처럼 먹이사슬 바로 위의 천적 말이죠.
속으로 ‘재선충의 천적이 분명 있다!’고 외쳤어요. 재선충으로 죽은 소나무 샘플을 구해서 현미경 3대를 놓고 3년간 연구를 계속했죠. 선충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지구상에는 2만여 가지 각기 다른 선충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재선충을 먹고 사는 천적 미생물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미생물을 배양시켜 재선충에 주입했더니 2~3시간만에 균이 죽었죠.
천적 곰팡이는 숙주로서 소나무 재선충만을 공격해 먹이로 삼아요. 이 곰팡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탄산가스, 질소, 물 등으로 완전 산화가 일어납니다. 살충제처럼 독성유발 물질이 아니니까요.”
— 감염목을 모두 살릴 수 있다고요?
“아뇨. 재선충에 감염됐다고 해도 가도관(물관)이 부분적으로 살아 있으면 이 천적 곰팡이가 물관을 타고 위로 올라가 재선충을 분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50% 이상 고사가 이뤄진 감염목은 물관이 무용지물이어서 천적도 소용없습니다.”
— 천적이 천연백신이어서 한계는 뭔가요.
“유기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아니라 생물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살선충 곰팡이(Esteya)균’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합성농약처럼 수년간 약효를 지니지 못해요. 상온에서는 약 10일 정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아직 연구해야 할 게 많아요. 어떻게 선충을 찾아가, 어떻게 숙주인 재선충을 섭식하는지 계속 실험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은 섭씨 25도 내외에서는 3~4일이면 다시 알을 낳고 애기선충으로 태어납니다. 여름 시기, 재선충 한 쌍이 약 20일 후 20만 마리로 불어나요.
그게 쉽지 않은 연구입니다. 인삼을 수 년간 연구해도 어떤 사포닌 성분이 어떻게 해서 인체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지 밝혀진 게 없잖아요. 재선충에 천적을 주입하면 20년생 재선충 감염목에 재선충 10억 마리가 있다고 할 때, 완전 박멸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밝혀 내지 못했어요. 재선충을 박멸한 뒤 천적균이 어떻게 감염목에 기생하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연구해야 할 게 많아요.”
아쉬운 제주지역 재선충 방제검증
성 교수 연구팀은 2016년 초 제주지역 재선충 방제효과 검증단에 참여했다. 국유지인 제주 한림읍 일대 건강한 소나무(해송) 120그루를 4개 그룹으로 묶어 인위적으로 재선충을 주입했다.
첫째 그룹(한 그룹당 소나무 30그루)은 증류수(물)를 소나무에 주입했고, 둘째 그룹은 재선충을 주입해 소나무가 일부러 고사하도록 했다. 셋째 그룹은 성 교수가 개발한 천적균을 먼저 주입하고 20여일 후 재선충을 집어넣었다. 넷째 그룹은 재선충을 주입하고 한 달이 흐른 뒤 백신을 주입해 나무가 살아나는지 여부를 살폈다.
실험결과는 이랬다. 셋째 그룹 소나무의 69.1%가 죽거나 죽어 갔다. 또 넷째 그룹은 소나무의 71.4%가 고사했다. 반대로 얘기해 셋째 그룹의 31%, 넷째 그룹의 29%가 살았거나 살고 있다. 성 교수의 말이다.
“산림청에서는 백신 주입 후 감염목의 80%가 살아나야 효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20~30% 내외만 살아났으니 제가 개발한 천연 백신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학계에선 미생물 약제의 경우 50% 효과만 있어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재선충 3만 마리를 투입한 뒤 한 달 후에 단 한 번의 치료로 20% 내외의 감염목을 살려놨으니 치료효과는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일단 재선충에 감염되면 3~4주 후 100% 고사된다는 게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정설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과장하거나 거짓 연구를 했다면 충남대 교수로서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로 책임지겠습니다.”
성 교수의 천연백신이 성공할 수 있을까. 산림청이 세운 ‘감염목 생존율 80%’는 지나치게 높은 문턱이다. 예를들어 불치의 암환자 30%를 살리는 항암제가 개발됐다면 80%가 아니어서 폐기해야 할까. 그는 “재차 실험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재선충이 심한 청도, 칠곡, 안동, 울산 등지로 내려가 실험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세계 최초의 백신으로 이 나라 20억 그루의 소나무를 살릴 기회를 주십시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초록색의 솔잎이 연두색으로 변한다. 변색이 확인되면 3~4개월 이내에 거의 죽어 버린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아시아에선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타이완과 베트남 등지에서 발견됐고 유럽은 포르투갈·스페인, 북미에서는 미국·캐나다, 그리고 중남미의 온두라스 등지에서 감염사실이 학계에 보고됐다. 각국이 비상이다.
문제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다는 사실이다. 국내 예방·치료제는 없고 수입약품이 전부다. 산림청의 방제 매뉴얼이라는 것도 미봉책. ‘아바맥틴’이라 부르는 예방주사를 놓거나,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벌채해 태우는 것이 전부다. 태우지 않으면 톱밥으로 가공한다.
국내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이 2013년 4258ha, 2014년 1만3121ha, 2015년 1만4618ha, 올 들어 2만4173ha로 늘어났다. 재선충이 발견된 곳은 전국 98개 시·군·구. 국내 200만 그루 내외가 고사했고 피해액은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른다. 극심한 지역은 제주, 울산, 안동, 구미, 포항, 거제 등지다. 올해엔 세종, 금산, 영동, 전주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다만, 산림청은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가 줄고 있다고 주장한다. “올 4월 현재 감염목이 137만 그루로 작년 같은 기간에 발견된 174만 그루보다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줄어든 이유는 간단하다. 감염 나무가 확인되는 족족 베어내기 때문이다.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 주변 20m 이내 멀쩡한 나무까지 가차 없이 벤다. 겉으론 줄고 있다지만 산림청과 감염목이 있는 지자체는 속병을 앓고 있다. 방제예산을 편성하는 국회 농해수위 역시 답답하긴 마찬가지. 해마다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선도적인 연구결과나 원천기술이 확보됐다는 소식이 안 들린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의 말이다.
“(방제예산이 아닌) 연구개발비로 지난 2006년부터 124억원을 투입했어요. 특허 등록 8건, 특허 출원 21건, 논문 116편이 나왔으나 재선충 방제를 위한 약재개발 성과는 전무합니다. 목표가 분명한 실제 재선충을 방제하기 위한 연구보다는 겨우 피상적인 논문 쓰는 데 급급하고 논문 1편에 1억원의 연구비를 쓰고 있어요.”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134억4000만원의 재선충 연구비를 추가로 책정한 상태다. 그러나 국회 농해수위는 재선충 연구개발(R&D) 예산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나무 재선충의 ‘천적’ 찾아
 |
| 2016년 3월 29일 강원도 홍천군의 한 야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감염목 반경 20m 이내 나무는 모두 베어냈다. |
“현재 정부의 재선충 방제방법이란게 답답합니다. 가을에 감염목과 그 주변 반경 20m 내의 나무를 ‘모두 베기’나 ‘일부 베기’로 전부 잘라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딱 맞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매년 봄에는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는 맹독성 농약을 살포합니다. 이런 방제가 무용지물인 것은 이미 재선충 방제를 거의 포기하고 있는 타이완이나 일본에서 해 왔던 방법들의 정확한 답습입니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소나무 재선충의 ‘천적(天敵)’을 찾아내 재선충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생물학계에 ‘천적’이란 먹이연쇄에서 잡아먹히는 동물에 대해 잡아먹는 동물을 일컫는다.
— 천적을요?
“네, 천적 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 잣나무 등에 기생해 나무를 갉아먹는 선충을 말합니다. 솔수염하늘소에 기생하며 다른 나무로 이동합니다. 저는 어떤 개체든 천적이 있다는 생각에 착안, 2006년부터 계속 세포를 관찰하다가 한국형 재선충 천적을 발견했어요.
이미 관련 논문 25편을 썼고 곧 《네이처》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재선충 천적 곰팡이는 소나무 조직 속에 숨어 있는 재선충을 찾아내 머리부터 집중 공격을 해서 수 시간에 재선충을 죽입니다.”
성 교수는 “수많은 실험연구, 경남 진주와 제주에서의 현장연구로 재선충 감염목을 살릴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수십 그루의 죽어 가던 변색된 소나무에서 푸른 잎이 다시 돋았다”고 했다.
“어쩌면 세계 처음으로 선충 감염목을 다시 살려낸 겁니다. 향후 어떻게 보완하고 적극 활용하느냐에 따라 재선충 감염 소나무를 완전히 살려낼 수 있다고 봅니다.”
성 교수가 재선충 천적에 관심을 갖게 된 사연은 이렇다. 2003년쯤 대구로 내려가는 길에 우연히 참외 재배로 유명한 경북 성주에 들렀다고 한다.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참외가 작고 잎이 시들시들하기에 농민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참외 뿌리선충’ 때문이란 얘기를 들었다. 아무리 농약을 쳐도 선충이 죽지 않고 내성만 키우더란 것이다.
대학 연구실로 돌아온 그는 참외에 해가 없고, 선충만 잡는 천연약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본초강목》 《동의보감》을 뒤졌다. 의서(醫書)에 소개된 3500여 가지 식물을 살피다가 계피나무 뿌리엔 선충이 기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곧바로 계피를 활용한 천연약제 개발에 착수했다. 성 교수의 말이다.
‘참외 뿌리선충’ 박멸 경험
 |
| 현미경으로 보이는 아래가 건강한 소나무 재선충. 위쪽은 천연백신인 ‘살선충 곰팡이(Esteya)균’이 재선충의 머리를 집중공격하고 있는 모습. |
그때 누군가가 그래요. 참외 뿌리선충도 잡았는데, 소나무 재선충 역시 치료제가 있을 거라고요. 당시 경북 청도가 재선충 감염으로 시름하고 있었어요. 청도에 내려가 계피를 링거에 넣어 재선충 감염목에 수간(樹幹)주사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링거에 송진이 차올라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는 실패를 거울삼아 본격적으로 재선충 치료에 뛰어들었다. “전 세계 재선충 방제약이 없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꼈다”고 했다.
“소나무 묘목 1000그루를 사서 비슷한 실험을 계속하는데 그때 머릿속에 신기한 것이 지나가더군요. 생물학계에선 천적이 중요해요. 쥐가 아무리 잘나도 고양이를 못 이기듯, 진딧물에 대한 무당벌레, 메뚜기와 사마귀 사이처럼 먹이사슬 바로 위의 천적 말이죠.
속으로 ‘재선충의 천적이 분명 있다!’고 외쳤어요. 재선충으로 죽은 소나무 샘플을 구해서 현미경 3대를 놓고 3년간 연구를 계속했죠. 선충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지구상에는 2만여 가지 각기 다른 선충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재선충을 먹고 사는 천적 미생물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미생물을 배양시켜 재선충에 주입했더니 2~3시간만에 균이 죽었죠.
천적 곰팡이는 숙주로서 소나무 재선충만을 공격해 먹이로 삼아요. 이 곰팡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탄산가스, 질소, 물 등으로 완전 산화가 일어납니다. 살충제처럼 독성유발 물질이 아니니까요.”
— 감염목을 모두 살릴 수 있다고요?
“아뇨. 재선충에 감염됐다고 해도 가도관(물관)이 부분적으로 살아 있으면 이 천적 곰팡이가 물관을 타고 위로 올라가 재선충을 분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50% 이상 고사가 이뤄진 감염목은 물관이 무용지물이어서 천적도 소용없습니다.”
— 천적이 천연백신이어서 한계는 뭔가요.
“유기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아니라 생물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살선충 곰팡이(Esteya)균’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합성농약처럼 수년간 약효를 지니지 못해요. 상온에서는 약 10일 정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아직 연구해야 할 게 많아요. 어떻게 선충을 찾아가, 어떻게 숙주인 재선충을 섭식하는지 계속 실험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은 섭씨 25도 내외에서는 3~4일이면 다시 알을 낳고 애기선충으로 태어납니다. 여름 시기, 재선충 한 쌍이 약 20일 후 20만 마리로 불어나요.
그게 쉽지 않은 연구입니다. 인삼을 수 년간 연구해도 어떤 사포닌 성분이 어떻게 해서 인체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지 밝혀진 게 없잖아요. 재선충에 천적을 주입하면 20년생 재선충 감염목에 재선충 10억 마리가 있다고 할 때, 완전 박멸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밝혀 내지 못했어요. 재선충을 박멸한 뒤 천적균이 어떻게 감염목에 기생하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연구해야 할 게 많아요.”
아쉬운 제주지역 재선충 방제검증
 |
| 2013년 11월 19일 제주시 오등동 일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에 투입된 국군 장병이 고사목을 나르고 있다. |
첫째 그룹(한 그룹당 소나무 30그루)은 증류수(물)를 소나무에 주입했고, 둘째 그룹은 재선충을 주입해 소나무가 일부러 고사하도록 했다. 셋째 그룹은 성 교수가 개발한 천적균을 먼저 주입하고 20여일 후 재선충을 집어넣었다. 넷째 그룹은 재선충을 주입하고 한 달이 흐른 뒤 백신을 주입해 나무가 살아나는지 여부를 살폈다.
실험결과는 이랬다. 셋째 그룹 소나무의 69.1%가 죽거나 죽어 갔다. 또 넷째 그룹은 소나무의 71.4%가 고사했다. 반대로 얘기해 셋째 그룹의 31%, 넷째 그룹의 29%가 살았거나 살고 있다. 성 교수의 말이다.
“산림청에서는 백신 주입 후 감염목의 80%가 살아나야 효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20~30% 내외만 살아났으니 제가 개발한 천연 백신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학계에선 미생물 약제의 경우 50% 효과만 있어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재선충 3만 마리를 투입한 뒤 한 달 후에 단 한 번의 치료로 20% 내외의 감염목을 살려놨으니 치료효과는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일단 재선충에 감염되면 3~4주 후 100% 고사된다는 게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정설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과장하거나 거짓 연구를 했다면 충남대 교수로서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로 책임지겠습니다.”
성 교수의 천연백신이 성공할 수 있을까. 산림청이 세운 ‘감염목 생존율 80%’는 지나치게 높은 문턱이다. 예를들어 불치의 암환자 30%를 살리는 항암제가 개발됐다면 80%가 아니어서 폐기해야 할까. 그는 “재차 실험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재선충이 심한 청도, 칠곡, 안동, 울산 등지로 내려가 실험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세계 최초의 백신으로 이 나라 20억 그루의 소나무를 살릴 기회를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