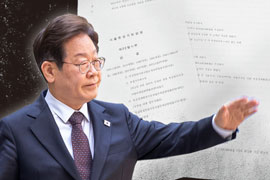⊙ 호주, 20세기 이후 미국이 참전한 모든 주요 전쟁에 참전한 진정한 혈맹
⊙ “미국이 호주에 자국 핵 기술 접근 허용한 것은 미중 전쟁에 참전하라는 의미”(휴 화이트 ANU 전략학 석좌교수)
⊙ 미중 패권 와중에도 쿼드, 오커스, 파이브 아이스 등 통해 미국과 적극적 협력
⊙ 한국, ‘오커스’ ‘쿼드 플러스’에 동참해 多者 안보협력 강화해야
성종은
2001년생. 호주 시드니대 국제정치학 졸업 / 前 주한미국대사관 정치국 인턴, 《조선일보》 인턴
⊙ “미국이 호주에 자국 핵 기술 접근 허용한 것은 미중 전쟁에 참전하라는 의미”(휴 화이트 ANU 전략학 석좌교수)
⊙ 미중 패권 와중에도 쿼드, 오커스, 파이브 아이스 등 통해 미국과 적극적 협력
⊙ 한국, ‘오커스’ ‘쿼드 플러스’에 동참해 多者 안보협력 강화해야
성종은
2001년생. 호주 시드니대 국제정치학 졸업 / 前 주한미국대사관 정치국 인턴, 《조선일보》 인턴

- 2023년 3월 13일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로마 해군기지에서 오커스 정상회담이 열렸다. 왼쪽부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낙 영국 총리. 사진=AP/뉴시스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되면서 윤석열(尹錫悅) 정부의 대미(對美) 정책과 한미(韓美)동맹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진보 정당 또는 보수 정당의 집권 여부에 따라 한미동맹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도, 강화되기도 하는 변화무쌍(變化無雙)한 정치적 현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에서 외교·안보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정점(頂點)으로 하는 행정부의 역할이 크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이 미국과 일본 일변도였으며,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해왔다. 앞으로 야권은 국회에서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압력을 가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가 국제정치학을 공부했던 호주의 외교·안보 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무엇보다도 호주는 양대 정당인 노동당 또는 자유당 중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대미(對美) 정책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적기 때문이다.
호주는 제1·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미국이 참전한 20세기 이후의 모든 주요 전쟁에 참전(물론 1·2차 세계대전은 영연방의 일원으로 참전했다는 성격이 강하다)한 그야말로 미국의 혈맹(血盟)이다. 1951년 호주는 뉴질랜드·미국과 앤저스조약(ANZUS Treaty, 호주·뉴질랜드·미국 3개국 안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동맹국이 되었다. 앤저스조약은 1986년 뉴질랜드가 탈퇴하면서 사실상의 호주·미국 동맹으로 기능하고 있다.
美中 패권 경쟁 속 미국 편에 선 호주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에도 호주는 미국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존 하워드 당시 호주 총리는 9·11 테러를 사실상 자국에 대한 테러로 간주하며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수많은 군인을 파병했다.
호주는 미중(美中) 패권(覇權)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다른 국가처럼 ‘헤징(hedging)’ 전략을 전개하는 대신, 미국의 가장 든든한 우군(友軍)이 되어주고 있다.
21세기 이전 시기에는 성공적인 미중 데탕트와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국 최고지도자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사상으로 인해 미국에 있어서 중국은 전략적 각축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세는 비교적 평화로웠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특히 시진핑(習近平) 집권 이후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호주는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팍스 시니카(Pax Sinica·중국 주도의 세계평화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각종 불이익이 있음에도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미국 주도의 세계평화체제)’에 기여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호주는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미국, 일본, 필리핀과 공동 군사훈련을 여러 차례 진행해왔다. 호주 외교통상부는 공식적으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동이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성명을 내는 등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왔다. 중국이 제시한 21세기의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원칙 중 하나인 ‘핵심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에도 호주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과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은 것이다.
호주는 그동안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전개했을까? 먼저 호주의 안보 전략을 간략히 살펴보자. 호주는 대표적으로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대화)’ ‘오커스 동맹(AUKUS, 미국·영국·호주 3국 안보동맹)’ ‘파이브 아이스 정보동맹(Five Eyes·FVEY,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 정보기관 협의체)’ ‘앤저스 조약(ANZUS Treaty, 미국·호주·뉴질랜드 3개국 군사동맹)’, 그리고 ‘오스민 회담(AUSMIN. 호주-미국 국방 및 외교장관회담)’ 등 ‘앵글로색슨(Anglo-Saxon)’ 국가 간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왔다. 이 외에도 호주는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포럼 국가들을 포섭하는 전략을 통해 지역 차원의 다자적 안보협력을 추동해왔다.
사이버 안보에서도 적극 협력
필자는 《조선일보》 인턴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 8일 스콧 모리슨 전 호주 총리와 인터뷰를 하면서 ‘쿼드 안보 협의체와 관련하여 한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물었다. 모리슨 전 총리는 쿼드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하게 지지한다”면서 “한국이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더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리슨 전 총리는 “북한의 핵 개발 등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도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모리슨 전 총리 재임 당시 호주-미국 동맹은 이전보다 진일보(進一步)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바로 오커스 동맹 형성에 있어 주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모리슨 전 총리는 오커스 동맹을 통해 당시 미국 동맹국 중에서는 드물게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전수받기로 했다. 이로써 호주는 2060년까지 최대 13척의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모리슨 전 총리가 프랑스 방산업체와 체결한 약 900억 달러 규모의 디젤 잠수함 구매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프랑스와의 관계가 한때 악화되기는 했다. 하지만 그는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성공적으로 확보하며 호주의 국익(國益)을 수호하고 호주-미국 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호주는 전통적 안보 분야뿐 아니라, 사이버 영역의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도 호주-미국 동맹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왔다. 《호주의 사이버 안보의 전략: 인도·태평양 지역과 중견국 외교》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호주는 미국과의 군사·정보동맹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동맹국으로서 자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중시해왔다. 2016년과 2017년에 발간된 호주 국방백서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파이브 아이스 정보동맹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고, 그 노력의 일례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중국과 거리를 두며, 국가광대역통신망(NBN)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고 있다.
‘아시아판 나토’
호주-미국 동맹에 대해 호주 학계의 생각은 어떠할까?
필자는 지난해 11월 시드니대학교 미국학센터(USSC)가 주최한 시드니국제전략포럼(Sydney International Strategy Forum)에 초청받아 마이클 그린 교수의 호주-미국 동맹에 대한 분석을 들어볼 수 있었다. 마이클 그린 교수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조지 W 부시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으로 근무했고,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및 일본 석좌를 역임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 동맹국의 안보 전략에 능통한 학자다.
이 자리에서 마이클 그린 교수는 ‘아시아판 나토(NATO)’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가 언급한 ‘아시아판 나토’란 중국의 부상(浮上)을 견제하고 잠재적 전쟁 위협을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공식 석상에서는 ‘아시아판 나토’를 따로 구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마이클 그린 교수는 “만약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은 함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집단적 안보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드니국제전략포럼에서는 호주-미국 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시드니대학교 미국학센터(USSC)가 호주, 미국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호주, 미국 모두 대중(對中) 정책과 관련된 항목에서 큰 공감대를 보였다. 호주 국민의 60%, 미국 국민의 58%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정책에 대해 찬성했다. 위와 같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호주·미국 양국은 지도부 차원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도 서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호주가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兩者擇一)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해 휴 화이트 호주국립대학교(ANU) 전략학 석좌교수는 “미국이 호주에 자국의 핵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결국 미중 전쟁에 호주도 참전하라는 의미이며, 호주 정부는 그런 위험 감수가 할 만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임스 커런 시드니대학교 근대사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호주는 중국에 맞서는 미국의 결단력과 의지에 집 전체를 건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동맹을 무임승차로 생각하는 한국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러 왔을까? 한국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서 함께 피 흘려 싸워온 혈맹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호주-미국 동맹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호주는 미국이 개입된 거의 모든 전쟁·분쟁에 적극 참여하며 치른 대가가 있는 반면,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으로부터 단순히 수혜를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해서도 유사시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히 여기면서도 미국이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파병 때에도 이리 재고 저리 잰 끝에 전투부대가 아니라 건설·의료 등 민사(民事)부대를 보내는 데 그쳤다. 대만해협에서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정치권이나 학계에서는 유사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等距離)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보뿐 아니라 인권과 같은 분야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주한미국대사관 정치국 인턴으로 미국 국무부 실무자, 미국 외교관 등과 함께 일하며 한미동맹의 최전선을 말석에서나마 직접 관찰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7일에는 정 박 당시 미국 국무부 대북(對北)특별부대표와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북한 인권 간담회 준비를 돕고 참관한 바 있다. 미국이 고위급 담당자를 임명해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자세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이 매우 신기했다. 사실상 하나의 제국(帝國)을 운영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외교·인권 문제가 하나둘이 아닐 텐데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제국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한국은 대국적(大局的)으로 국제 정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대미(對美) 외교와 대북(對北) 문제에만 치중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핵개발보다 한미동맹 역량 강화해야
호주-미국 동맹의 성공적인 발전은 한미동맹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미동맹에서 한국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에 확실한 전략적 가치를 제공해야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한미동맹에서 실질적으로 한국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대가를 치르려면, 미국의 이른바 ‘통합억지(integrated deterrence)’ 전략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필자는 학부 2학년 시절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의 ‘동아시아연구원(EAI) 사랑방’ 프로그램을 통해 2022년 한 해 동안 국제정치학을 배웠다. 당시 하영선 명예교수의 “자체 핵무장도, 전술핵도 대안이 아니다: 한미동맹 역량 강화 나서야 하는 이유”라는 2022년 10월 자 논평이 기억에 남는다. 하 교수는 “한미동맹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형 3축(軸) 체계’와 미국의 ‘통합억지’ 체제를 결합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형 3축 체계’의 구성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징후를 미리 포착하여 선제 타격하는 이른바 ‘킬체인’, 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그리고 ‘대량응징보복’ 등이 있다. ‘통합억지’란 재래식 무기, 핵무기, 사이버, 더 나아가 우주까지의 공간을 통합적으로 포함한 형태의 억제이다. 이러한 제언을 기반으로 한국형 3축 체계와 미국의 통합억지 체제를 성공적으로 결합시킨다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개하고 있는 통합억지 전략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국 정부는 한미 양국 안보협력 강화에도 집중하되, ‘오커스’ 또는 ‘쿼드 플러스’에 동참해 유사입장 국가들과의 다자 안보협력 또한 강화해야 한다.
多者 안보협력 강화해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한국 정부는 호주 정부와 미국·영국·호주의 핵잠수함 동맹인 ‘오커스’의 첨단기술·무기개발 협력체인 ‘필라(Pillar) 2’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도 논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전통적 안보 부문에서의 다자 안보협력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졌지만, 비전통적 안보협력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쿼드 플러스’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사이버 안보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22대 국회와 대통령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북한의 신종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익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자처하는 한국은 향후 어떠한 노선을 선택해야 할까? 비록 향후 3년간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며 여야 간 대미(對美) 정책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당당한 외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 되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인권, 자유, 법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가 국제정치학을 공부했던 호주의 외교·안보 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무엇보다도 호주는 양대 정당인 노동당 또는 자유당 중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대미(對美) 정책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적기 때문이다.
호주는 제1·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미국이 참전한 20세기 이후의 모든 주요 전쟁에 참전(물론 1·2차 세계대전은 영연방의 일원으로 참전했다는 성격이 강하다)한 그야말로 미국의 혈맹(血盟)이다. 1951년 호주는 뉴질랜드·미국과 앤저스조약(ANZUS Treaty, 호주·뉴질랜드·미국 3개국 안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동맹국이 되었다. 앤저스조약은 1986년 뉴질랜드가 탈퇴하면서 사실상의 호주·미국 동맹으로 기능하고 있다.
美中 패권 경쟁 속 미국 편에 선 호주
 |
| 호주 멜버른 전쟁기념관에 서 있는 호주군 전사자 추모비. 사진=성종은 |
호주는 미중(美中) 패권(覇權)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다른 국가처럼 ‘헤징(hedging)’ 전략을 전개하는 대신, 미국의 가장 든든한 우군(友軍)이 되어주고 있다.
21세기 이전 시기에는 성공적인 미중 데탕트와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국 최고지도자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사상으로 인해 미국에 있어서 중국은 전략적 각축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세는 비교적 평화로웠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특히 시진핑(習近平) 집권 이후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호주는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팍스 시니카(Pax Sinica·중국 주도의 세계평화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각종 불이익이 있음에도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미국 주도의 세계평화체제)’에 기여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호주는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미국, 일본, 필리핀과 공동 군사훈련을 여러 차례 진행해왔다. 호주 외교통상부는 공식적으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동이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성명을 내는 등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왔다. 중국이 제시한 21세기의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원칙 중 하나인 ‘핵심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에도 호주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과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은 것이다.
호주는 그동안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전개했을까? 먼저 호주의 안보 전략을 간략히 살펴보자. 호주는 대표적으로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대화)’ ‘오커스 동맹(AUKUS, 미국·영국·호주 3국 안보동맹)’ ‘파이브 아이스 정보동맹(Five Eyes·FVEY,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 정보기관 협의체)’ ‘앤저스 조약(ANZUS Treaty, 미국·호주·뉴질랜드 3개국 군사동맹)’, 그리고 ‘오스민 회담(AUSMIN. 호주-미국 국방 및 외교장관회담)’ 등 ‘앵글로색슨(Anglo-Saxon)’ 국가 간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왔다. 이 외에도 호주는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포럼 국가들을 포섭하는 전략을 통해 지역 차원의 다자적 안보협력을 추동해왔다.
사이버 안보에서도 적극 협력
필자는 《조선일보》 인턴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 8일 스콧 모리슨 전 호주 총리와 인터뷰를 하면서 ‘쿼드 안보 협의체와 관련하여 한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물었다. 모리슨 전 총리는 쿼드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하게 지지한다”면서 “한국이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더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리슨 전 총리는 “북한의 핵 개발 등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도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모리슨 전 총리 재임 당시 호주-미국 동맹은 이전보다 진일보(進一步)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바로 오커스 동맹 형성에 있어 주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모리슨 전 총리는 오커스 동맹을 통해 당시 미국 동맹국 중에서는 드물게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전수받기로 했다. 이로써 호주는 2060년까지 최대 13척의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모리슨 전 총리가 프랑스 방산업체와 체결한 약 900억 달러 규모의 디젤 잠수함 구매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프랑스와의 관계가 한때 악화되기는 했다. 하지만 그는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성공적으로 확보하며 호주의 국익(國益)을 수호하고 호주-미국 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호주는 전통적 안보 분야뿐 아니라, 사이버 영역의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도 호주-미국 동맹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왔다. 《호주의 사이버 안보의 전략: 인도·태평양 지역과 중견국 외교》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호주는 미국과의 군사·정보동맹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동맹국으로서 자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중시해왔다. 2016년과 2017년에 발간된 호주 국방백서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파이브 아이스 정보동맹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고, 그 노력의 일례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중국과 거리를 두며, 국가광대역통신망(NBN)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고 있다.
‘아시아판 나토’
 |
| 지난해 11월 시드니대학교 미국학센터(USSC)가 주최한 시드니국제전략포럼(Sydney International Strategy Forum)에서 발언 중인 마이클 그린 교수(맨 오른쪽). 사진=성종은 |
필자는 지난해 11월 시드니대학교 미국학센터(USSC)가 주최한 시드니국제전략포럼(Sydney International Strategy Forum)에 초청받아 마이클 그린 교수의 호주-미국 동맹에 대한 분석을 들어볼 수 있었다. 마이클 그린 교수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조지 W 부시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으로 근무했고,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및 일본 석좌를 역임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 동맹국의 안보 전략에 능통한 학자다.
이 자리에서 마이클 그린 교수는 ‘아시아판 나토(NATO)’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가 언급한 ‘아시아판 나토’란 중국의 부상(浮上)을 견제하고 잠재적 전쟁 위협을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공식 석상에서는 ‘아시아판 나토’를 따로 구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마이클 그린 교수는 “만약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은 함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집단적 안보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드니국제전략포럼에서는 호주-미국 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시드니대학교 미국학센터(USSC)가 호주, 미국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호주, 미국 모두 대중(對中) 정책과 관련된 항목에서 큰 공감대를 보였다. 호주 국민의 60%, 미국 국민의 58%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정책에 대해 찬성했다. 위와 같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호주·미국 양국은 지도부 차원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도 서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호주가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兩者擇一)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해 휴 화이트 호주국립대학교(ANU) 전략학 석좌교수는 “미국이 호주에 자국의 핵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결국 미중 전쟁에 호주도 참전하라는 의미이며, 호주 정부는 그런 위험 감수가 할 만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임스 커런 시드니대학교 근대사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호주는 중국에 맞서는 미국의 결단력과 의지에 집 전체를 건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동맹을 무임승차로 생각하는 한국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러 왔을까? 한국도 호주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서 함께 피 흘려 싸워온 혈맹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호주-미국 동맹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호주는 미국이 개입된 거의 모든 전쟁·분쟁에 적극 참여하며 치른 대가가 있는 반면,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으로부터 단순히 수혜를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해서도 유사시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히 여기면서도 미국이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파병 때에도 이리 재고 저리 잰 끝에 전투부대가 아니라 건설·의료 등 민사(民事)부대를 보내는 데 그쳤다. 대만해협에서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정치권이나 학계에서는 유사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等距離)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보뿐 아니라 인권과 같은 분야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주한미국대사관 정치국 인턴으로 미국 국무부 실무자, 미국 외교관 등과 함께 일하며 한미동맹의 최전선을 말석에서나마 직접 관찰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7일에는 정 박 당시 미국 국무부 대북(對北)특별부대표와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북한 인권 간담회 준비를 돕고 참관한 바 있다. 미국이 고위급 담당자를 임명해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자세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이 매우 신기했다. 사실상 하나의 제국(帝國)을 운영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외교·인권 문제가 하나둘이 아닐 텐데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제국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한국은 대국적(大局的)으로 국제 정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대미(對美) 외교와 대북(對北) 문제에만 치중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핵개발보다 한미동맹 역량 강화해야
호주-미국 동맹의 성공적인 발전은 한미동맹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미동맹에서 한국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에 확실한 전략적 가치를 제공해야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한미동맹에서 실질적으로 한국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대가를 치르려면, 미국의 이른바 ‘통합억지(integrated deterrence)’ 전략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필자는 학부 2학년 시절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의 ‘동아시아연구원(EAI) 사랑방’ 프로그램을 통해 2022년 한 해 동안 국제정치학을 배웠다. 당시 하영선 명예교수의 “자체 핵무장도, 전술핵도 대안이 아니다: 한미동맹 역량 강화 나서야 하는 이유”라는 2022년 10월 자 논평이 기억에 남는다. 하 교수는 “한미동맹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형 3축(軸) 체계’와 미국의 ‘통합억지’ 체제를 결합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형 3축 체계’의 구성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징후를 미리 포착하여 선제 타격하는 이른바 ‘킬체인’, 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그리고 ‘대량응징보복’ 등이 있다. ‘통합억지’란 재래식 무기, 핵무기, 사이버, 더 나아가 우주까지의 공간을 통합적으로 포함한 형태의 억제이다. 이러한 제언을 기반으로 한국형 3축 체계와 미국의 통합억지 체제를 성공적으로 결합시킨다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개하고 있는 통합억지 전략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국 정부는 한미 양국 안보협력 강화에도 집중하되, ‘오커스’ 또는 ‘쿼드 플러스’에 동참해 유사입장 국가들과의 다자 안보협력 또한 강화해야 한다.
多者 안보협력 강화해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한국 정부는 호주 정부와 미국·영국·호주의 핵잠수함 동맹인 ‘오커스’의 첨단기술·무기개발 협력체인 ‘필라(Pillar) 2’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도 논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전통적 안보 부문에서의 다자 안보협력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졌지만, 비전통적 안보협력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쿼드 플러스’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사이버 안보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22대 국회와 대통령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북한의 신종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익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자처하는 한국은 향후 어떠한 노선을 선택해야 할까? 비록 향후 3년간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며 여야 간 대미(對美) 정책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당당한 외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 되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인권, 자유, 법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