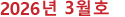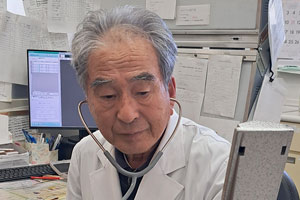⊙ SDV, 주행·제동·조향 기능 등을 SW 업데이트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차량
⊙ 토요타, 2020년 ‘소프트웨어 퍼스트’ 선언… 작년 10월 ‘디지털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신설
⊙ 중국, 정부가 앞장서서 API 표준화 전략… BYD와 Xpeng, 테슬라처럼 SDV 차량 구현
⊙ 일본, 중국 모방해서 모빌리티 디지털 전환(DX) 전략 추진
⊙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의 길이, 1000만 行(2010년) → 1억 행(2020년)… 자율주행 기능 차는 3억~5억 행 수준
⊙ 자동차 회사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반도체 설계에 직접 관여해야 하는 시대
朴正圭
1968년생. 한양대 기계공학과 졸업,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석사, 일본 교토대 정밀공학과 박사, 미시간대학 방문학자 / 기아자동차 중앙기술연구소 연구원, 日 교토대 정밀공학과 조교수, LG전자 생산기술원, 현대자동차 자동차산업연구소·해외공장지원실 근무,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겸임교수 역임. 現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직교수 / 번역서 《반도체초진화론》 《실천 모듈러 설계》 《모노즈쿠리》
⊙ 토요타, 2020년 ‘소프트웨어 퍼스트’ 선언… 작년 10월 ‘디지털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신설
⊙ 중국, 정부가 앞장서서 API 표준화 전략… BYD와 Xpeng, 테슬라처럼 SDV 차량 구현
⊙ 일본, 중국 모방해서 모빌리티 디지털 전환(DX) 전략 추진
⊙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의 길이, 1000만 行(2010년) → 1억 행(2020년)… 자율주행 기능 차는 3억~5억 행 수준
⊙ 자동차 회사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반도체 설계에 직접 관여해야 하는 시대
朴正圭
1968년생. 한양대 기계공학과 졸업,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석사, 일본 교토대 정밀공학과 박사, 미시간대학 방문학자 / 기아자동차 중앙기술연구소 연구원, 日 교토대 정밀공학과 조교수, LG전자 생산기술원, 현대자동차 자동차산업연구소·해외공장지원실 근무,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겸임교수 역임. 現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직교수 / 번역서 《반도체초진화론》 《실천 모듈러 설계》 《모노즈쿠리》

- 2023년 10월 25일 일본 모빌리티 쇼의 미디어 데이 브리핑에서 연설하는 사토 고지 토요타 사장.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자 플랫폼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2011년,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는 이유(Why Software is eating the world?)〉라는 칼럼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이 글은 ‘넷스케이프’라는 웹브라우저를 개발하여 일세를 풍미했던 마크 앤드리슨(Marc Andreessen)이 썼다. 그는 영화, 농업, 국방 분야에서 소프트웨어(SW) 기업이 기존 기업을 위협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십수 년이 지난 지금 그의 예상대로 소프트웨어는 자동차를 통째로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밀려들고 있다.
과거 자동차는 전통적인 기계 산업이었다. 자동차 메이커는 말처럼 황소처럼 달리는 차량, 근육질의 차량을 만들었다. 이후 전기·전자 산업의 발전으로 기계 부품에 마이크로 칩을 장착하여 기계의 미세한 움직임을 제어하기 시작했다. 마치 근육을 조절하는 일종의 자율신경계처럼 말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기계 산업과 전자 산업과의 융합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때에도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 칩에 내장된 형태로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은 차량에 고성능 컴퓨터(HPC·High Performance Computer)가 장착되고 그곳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에 따라 차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능이 달라진다. 마치 스마트폰처럼 차량의 소프트웨어가 무선(無線)으로 업데이트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것을 우리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oftware Defined Vehicle), SDV라고 한다. 지금 자동차 산업은 기계에서 전자로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SW)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자동차 제품 개발 과정
2020년 토요타 자동차 사장은 ‘소프트웨어 퍼스트’라는 선언을 했다. 작년 10월에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여 ‘디지털 소프트웨어 개발센터’를 신설했다. 현대차도 모든 차종을 SDV로 전환할 것을 밝히고 올해 초 연구소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SDV, 소프트웨어 퍼스트라는 용어의 의미를 살피고 앞으로의 차량 개발에 있어서의 과제를 생각해보자.
SDV(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를 설명하기에 앞서 자동차 제품 개발 과정과 특징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새로운 용어일수록 자동차 산업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파악해야 흔들림 없는 개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메이커는 먼저 새로운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제품의 콘셉트(concept)를 정한다.
가령 새로운 소형차를 개발한다고 가정해보자. 상품기획부서가 ‘콤팩트한 도심형 자동차’라는 차량의 콘셉트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콘셉트를 만족시킬 차량의 기능들, 가령 연비(燃費), 승차감 등의 목표치를 정한다. 이것을 기능설계라고 부른다.
목표로 하는 연비를 만족시키기 위해 차량의 무게를 줄이고 엔진 효율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면 연구개발부서는 기존 차량 대비 무게를 50kg 줄이고, 엔진의 압축비를 5% 올리는 작업을 실시한다. 차량 무게를 줄이기 위해 차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동일한 사이즈지만 가벼운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 차량의 크기를 줄일 경우에도 가능한 한 큰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부품들의 크기를 줄이거나 부품 배치를 변경하는 작업들을 진행한다.
이처럼 엔지니어들은 제품이 갖춰야 할 기능(Functional Requirements)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구조물(부품들)의 설계 파라미터(Design Parameters), 즉 부품의 치수를 정하고 재질을 결정한다. 이 과정을 설계(設計)라고 한다. 설계란 무형의 욕구(기능)를 만족시키기 위한 유형의 구체적인 정보를 만드는 것으로, 설계의 아웃풋은 도면(圖面)이다. 과거에는 설계된 정보를 종이 위에 그렸지만 지금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디지털화해서 저장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다. 생산(生産)이란 이런 설계 정보를 실물(실제의 물건)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설계 변경의 연쇄 효과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 설계 프로세스(Design Process)가 만만치 않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여 사람을 태우고 2t의 중량물을 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물건이다.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와 직결되고 고속으로 이동하기에 인명 사고가 날 수 있다. 자동차 엔지니어는 환경과 교통사고라는 두 가지 문제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운전자의 안전만을 위한 차량이라면 탱크 같은 차량을 만들면 되지만, 연비는 당연히 나쁘다. 가볍게 만들기 위해 얇은 철판으로 차체를 만들면 사고가 났을 때 차가 마치 종이처럼 구겨질 것이다. 즉 안전과 연비라는 기능이 서로 상충(相衝)한다.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런 상충 문제를 안고 있지만, 자동차의 경우 그 정도가 타(他)제품에 비해 심하다. 특히 연비도 좋고 안전하며 가격까지 저렴해야 할 경우, 설계 파라미터가 서로 복잡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한 명의 설계자가 자신이 담당한 부품의 치수를 변경하면 그 부품과 연결된 다른 부품의 설계 또한 변경해야 한다.
이런 설계 변경의 연쇄 효과는 하이브리드 차량(HEV)이 전기차(BEV)보다 크다. 그래서 자동차를 개발할 때에는 개발 과정 중간중간에 그동안 설계한 정보를 다 같이 점검하고 난 뒤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런 방식을 워터폴(Waterfall) 방식이라 부른다. 마치 폭포수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이미지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처럼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인력 간의 긴밀한 상호협조가 요구된다. 운동 경기로 치자면 팀워크를 중시하는 축구 경기와 비슷하다. 필자는 현대자동차 경영연구소(KARI)에서 근무하다가 1년간(2014년 11월~2015년 10월) 남양 연구소로 파견 근무를 간 적이 있다. 그때 관찰한 바에 따르면, 차체 설계부의 팀워크가 가장 좋았다. 철판을 연결하여 3차원의 완결된 차체 구조를 만들어야 하기에 동료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 불가결하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설계는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자동차의 경우 만족해야 할 기능을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계적인 측면에서 자동차 설계는 기능 설계보다 구조 설계에 중심을 둔다. 심지어는 구조물을 다 만들고 난 뒤에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기능을 발견하기도 한다.
ECU–엔진제어장치에서 전자제어장치로
자동차에 전자 장치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된 1960년대부터다. 특히 미국 의회가 1970년 12월에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소위 머스키법(Muskie Act)을 통과시키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법은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을 5, 6년 내에 10분의 1로 줄이도록 요구했다.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는 엔진 점화 시기와 같은 값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전자 장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978년 GM이 엔진제어장치(ECU·Engine Control Unit)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ECU는 마치 도시락통같이 생긴 것으로 그 안에 각종 전자기기를 서로 연결시켜놓은 인쇄 회로 기판(PCB)이 들어갔다. 이후 전자 장치가 엔진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에어백 등을 제어하는 데도 사용되면서 ECU는 전자제어장치(Electric Control Unit)의 약어로 변했다. 전자 장치가 기계 부품을 제어하는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한때 서울대 입학시험에서 최고 커트라인을 자랑하던 제어계측공학과가 생긴 것이 바로 1978년이다.
여기서 제어의 특징을 살펴보자. 제어(Control)란 어떤 대상물을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다 보니 만족시켜야 하는 기능(목표치)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고 난 뒤 적절한 제어 이론을 논리회로로 구현하여 목표치를 달성한다. 이때 전자 장치의 경우 목표치인 기능과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구조(논리회로, 전자회로) 간의 대응관계가 기계 장치에 비해 비교적 명료하다.
고급차, 100여 개의 ECU 장착
[그림1 상단]은 기계 부품 속에 들어간 전자 디바이스와 그 속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속 네모는 엔진, 브레이크, 에어백 등 자동차에서의 큰 기계 부품을 의미한다. 기계 부품은 덩치는 크지만 제어당하는 입장이고, 전자부품은 덩치는 작지만 제어를 하는 입장이다.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는 기계 부품에 마이크로 칩과 같은 전자 부품을 직접 장착하고 그 내부에는 제어하는 데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형태로 내장시킨다. 여기서 소프트웨어는 각 부품에 들어가는 특정 반도체에 맞춰 제작되었기에 수정하기 곤란하다.
전자제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설계는 [그림1 하단]처럼 기계→전자→소프트웨어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기계가 설계되지 않으면, 전자 장치의 설계를 진행할 수 없고, 전자 설계(가령 반도체 사양 결정)가 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를 짜기 힘든 구조임을 의미한다. 자동차의 경우 기계 부품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고 설계 난이도가 높아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개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도 주로 기계 공학 전공자이다.
하지만 고객의 니즈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엔진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에어백 등 전자 장치로 제어해야 할 부품이 많아졌다. 고급차의 경우 차량에 100여 개의 ECU가 장착되어 있다. 자동차에 전자 부품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새롭게 노출되기 시작했다.
인증시험 부정, 왜 일어나나
첫째, 전자 장치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양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ECU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생각해보자. 가령 운전자가 가속(加速)을 하기 위해 액셀을 밟았다고 하자. 그러면 액셀을 밟은 정도를 센서로 검출하고 차량 속도,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량을 고려하여 연비가 좋게 나오도록 가솔린을 엔진에 분사한다. 연비, 배출가스 등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래서 차량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길이 또한 늘어나, 2010년에는 약 1000만 행(行) 수준이었는데, 2020년에는 1억 행이 되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이 도입된 차는 3억~5억 행 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양이 증가하면 에러가 생기기 쉽고 개발 비용이 증가한다. 자동차의 전장 부품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1970년에 5%, 2000년에 22%, 2010년에 25%로 상승했다. 그리고 2030년에는 5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참조 : 2023년, 하버드 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 Woven Planet-Designing Software for the Car of the Future)
둘째, 차량 개발 기간이 길어졌다. 만일 기계 설계에 결함이 발견되면, 전자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해야 하거나, 시간이 부족하여 목표로 하는 기능을 완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출시해야 한다.
올해 1월 일본 다이하쓰의 대규모 인증시험 부정 사건이 발견되었다. 여러 부정 사건 중 눈여겨볼 만한 것이 충돌 시험 시 에어백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시험에서의 부정이다. 인증 시험 시에 에어백을 제어할 수 있는 ECU를 완성시키지 못하자 타이머를 부착해서 에어백이 작동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 시간이 부족해서 부정한 방식으로 인증을 먼저 받고, 나중에 제대로 된 ECU를 장착한 것이다. 현재와 같은 개발 방식으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차량 개발을 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머스크, 무선으로 SW 업데이트해 문제 해결
셋째,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어렵다. 가령 차량 앞에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면 과거에는 사람이 판단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전자화된 제동 장치가 노면 조건을 파악해서 가장 짧은 거리에서 차를 멈추도록 제어했다. 전자화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브레이크를 밟는 최종 의사 결정자는 운전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도, 차량 스스로 엔진 회전수를 줄이고, 자동적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며 승객의 안전을 위해 시트 벨트에 장착된 프리텐셔너(Pre-tensioner)가 운전자를 미리 꽉 잡아준다.
이처럼 각 부품이 서로 연계를 해서 구현하는 기능이 늘어나면서 [그림1]과 같이 기계에 단순히 전자 장치가 더해진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이제 자동차는 고도의 계산 능력을 가진 컴퓨터(HPC)가 요구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소프트웨어로 자동차의 개념을 바꾼 주인공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다. 우리는 흔히 테슬라를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테슬라는 2012년에 모델S를 출시하고, 2017년에 모델3를 판매하면서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테슬라의 차량은 배터리가 있는 전기차임과 동시에, 고도의 컴퓨팅 능력을 가지면서 차량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기능을 부가할 수 있는 차량이다. 이런 변화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일화가 있다.
미국에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s)》라는 자동차 평가 잡지가 있다. 2018년 이 잡지는 테슬라의 모델3가 포드의 픽업트럭 F-150보다 가볍지만, 제동거리는 더 길다면서 모델3의 구입을 추천하지 않았다.
이것을 본 일론 머스크는 그의 트윗(현재는 X)에 OTA로 제동거리를 더 짧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여기서 OTA는 오버 더 에어(Over the Air)의 약자로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기술을 말한다. 실제 일주일 만에 테슬라 차량은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모델3의 제동거리를 6m 짧게 만들었다(참조 : 시속 97km/h에서 정지까지의 거리 기준). 제동 장치는 자동차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데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버린 것이다. 결국 《컨슈머 리포트》는 모델3를 추천으로 변경했다.
주행·제동·조향 기능 업데이트되어야
작은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기존 자동차 메이커를 경악게 했다. 테슬라 차량은 SDV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전부터 이미 소프트웨어로 자동차의 기능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을 만들어낸 것이다.
여기서 SDV란 용어를 다시 살펴보자. SDV(Software Defined Vehicle)란 고객에게 차량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차량을 의미한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단지 소프트웨어 양이 많다고 해서 SDV라고 부르지 않는다.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급차의 소프트웨어 길이는 이미 1억 행 수준이다. 소프트웨어의 양이 아니라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SDV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차량의 기본 기능인 주행(Go), 제동(Stop), 조향(Handling) 기능 등이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관련 기능만 업데이트하는 차량은 굳이 SDV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림2]는 SDV 차량에서 기계-전자-소프트웨어의 연결 관계(아키텍처)를 나타낸 것이다. 기존 차량은 기계 장치 내에 전자 장치가 있고, 그 속에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다. 하지만 SDV에서는 차량용 운영체제(OS)가 있다. OS란 응용 SW와 하드웨어(전자) 사이에서, 응용 SW 실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자원을 할당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OS는 정부의 기능과 비슷하다. 정부는 토지, 예산 등의 자원을 국방, 복지 등에 할당한다. 비슷하게 컴퓨터에서는 윈도, 리눅스와 같은 OS가 CPU(중앙처리 장치), 메모리와 같은 자원을 워드, 인터넷 등과 같은 응용 SW에 할당한다. 정부 조직에 국방부, 외교부가 있는 것처럼 컴퓨터 운영체제 안에는 파일 시스템 관리, 메모리 관리 등과 같은 기능별 관리 시스템이 있다.
이런 OS의 가장 큰 역할은 HW(하드웨어)와 SW(소프트웨어)를 분리시킨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도 컴퓨터처럼 보다 손쉽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HAL과 API
여기에서, HAL(하드웨어 추상화)과 API라는 2가지 용어를 추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HAL(Hardware Abstraction Layer)을 직역하면 하드웨어(전자HW) 추상화를 의미한다.
추상화란 말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이 개념을 부지불식간에 사용하고 있다. 가령 컴퓨터에서 워드 작업을 하고 난 뒤에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고 외부 저장 장치인 USB에 저장할 수도 있다. 실제 컴퓨터 내부에서는 2개의 하드웨어(하드디스크와 USB)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OS(운영체제)는 사용자가 그 차이를 전혀 느낄 수 없도록 만들어준다. 이것이 추상화(Abstraction)다. 이런 추상화가 이루어지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손쉽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일종의 신호 규칙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방향지시등으로 이동할 방향을 알려주거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등이 켜져서 뒤차에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런 종류의 신호는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운 주체들 사이에 정보 전달 방식으로 유용하다.
소프트웨어, 인터넷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네이버가 지도를 제공하면서 지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API 형태로 제공하면, 누구나 그것을 보고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앱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API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중국 전기차가 빠른 성장을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차량용 API의 표준화 정책 덕분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다.
일본, 텐스토렌트에 반도차 설계 기술자 파견
차량 OS를 사용하면 100여 개의 ECU가 마치 스파게티 가닥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기존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여러 개의 ECU를 통합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HPC)가 필요하다. 이것 또한 테슬라가 돌파구를 만들었다.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 센서로 영상 데이터를 취득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동운전을 실현하고 싶어 한 테슬라는 2019년 3월에 FSD라는 이름의 컴퓨터를 개발하여 차량에 장착했다. 여기서 FSD는 완전자동운전(Full Self Driving)의 약자다. 실제로 완전 자동운전을 할 수 없지만, 어찌 되었든 테슬라는 FSD란 이름을 붙였고 이 용어로 규제당국과 여러 가지 다툼이 있다.
FSD 컴퓨터에는 반도체 칩의 사고·고장에 대비하여 2개의 FSD 칩이 들어가 있는데, 칩 하나당 데이터 처리 속도는 36TOPS(Tera Operations Per Second)이다. 1테라(Tera)는 1012(10의 12승)을 의미한다. 즉 36TOPS는 1초에 36조의 연산을 수행하는 반도체이다.
이 반도체 칩을 설계한 사람은 짐 켈러다. 그는 2016년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인 텐스토렌트(Tenstorrent)라는 스타트업 회사를 설립했고, 2023년에는 현대차와 삼성전자, LG전자가 투자를 했다. 일본은 올해 하반기부터 30~40대의 반도체 설계 기술자 200명을 선발하여 텐스토렌트에 파견을 보낸다고 한다. 바야흐로 자동차 회사가 운영체제도, 소프트웨어도, 반도체 설계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소프트웨어 퍼스트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는 SDV와 함께 소프트웨어 퍼스트(Software First)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앞에서 기존 자동차의 개발 방식은 기계 부품→전자 부품(ECU)→소프트웨어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이 방식이 점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특히 하드웨어의 개발 기간에 비해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이 늘어나고, IT 산업의 발전 속도가 빨라 기존 자동차 메이커의 개발체제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퍼스트라는 개념이 나왔다.
[그림3]은 2023년 11월, 토요타 자동차의 SDV 관련 책임자인 무라타 겐이치(村田賢一)가 소프트웨어 퍼스트를 설명하는 내용 중 일부다. 그는 게이오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소니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OS 관련 일을 하다가, 2008년부터 토요타 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해온 사람이다.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전자회사에서 실무를 경험한 엔지니어를 곧잘 만날 수 있다. 시대가 변했음을 방증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는 [그림3]의 왼쪽에 표시한 것처럼 ① 차량이 필요로 하는 기능 요구사항을 먼저 정의하고 ② 정의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ECU 하드웨어를 선택한 뒤 ③ 각 ECU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④ ECU 간 통신을 하면서 기능을 평가하는 순서로 차량을 개발했다. 차량을 제어해야 할 양이 한정된 상황에서, 사용하는 ECU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이 방식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림3]의 오른쪽에 표시한 방식으로 개발 방식을 변경하였다. 먼저 ① 차량이 필요로 하는 기능 요구사항을 정의한 후에 ② 기능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소프트웨어의 전체 구조(아키텍처)를 먼저 설계하고 개발을 한다. ③ 단 ECU 하드웨어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가상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개발해나간다. 마지막으로 ④ SW가 들어갈 ECU 하드웨어를 선정하여 적용시킨다. 이렇게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SW가 업데이트될 것을 고려해 비용이 들더라도 충분히 여유 있는 ECU를 확보해서 사용한다.
국가별 SDV 전환 방식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자동차가 소프트웨어가 정의된 차량으로 바뀌면 어떤 이점이 생길지 간단히 정리해보자.
첫째, 소프트웨어 기능 개발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분리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쉽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고객 만족도를 올릴 수 있다.
셋째, 소프트웨어를 통해 각 사용자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자동차 메이커는 차량 판매 이후에도 소프트웨어 판매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 자동차 메이커는 이와 같은 SDV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중국, 정부 주도로 API 표준화
자동차가 SDV로의 전환을 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다르다. 기존 자동차 메이커와 신흥 전기차 메이커 또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혁신은 역시 슈퍼맨 방식이다. 일론 머스크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와 기존 자동차의 문제점을 보고 근본부터 바꿔버리는 방식이다. 중국은 정부의 여러 가지 산업 지원 정책과 함께 또 그 나름의 기술 중심 창업자가 나타나면서 SDV로의 전환을 이루어내고 있다. 일본은 경쟁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자국 기업과 정부 관료가 모여 토론을 하면서 하나씩 개선하는 방식이다.
중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중국 전기차 산업의 발전은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보조금 덕분이라고 알려져 있다. 6월 21일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15년 동안 2310억 달러(약 300조원)를 지원했다.
이런 보조금 이외에 산업 진흥을 위한 정교한 정책도 있었다. 먼저 중국에는 ‘시장과 기술의 맞교환’이라는 정책이 있는데 중국어로 ‘이시장환기술(以市場换技術)’이라고 한다. 이것은 1979년부터 구상되어, 1982년부터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1984년부터 중국 기술 발전을 가속화시킬 중요한 방침으로 확정되었다. 이 정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외국 기업에 중국의 시장을 내주면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대신 그 기업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을 진흥시키는 방식이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테슬라는 2019년 상하이에 공장을 짓고, 2020년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이후부터 중국의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가령 중국의 전기차 메이커 BYD는 2020년 한(漢)이라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면서 나름 독자적인 자동차 개발 방식을 정립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했다. 중국자동차협회(CAAM)는 테슬라 차량이 전기차임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API 표준화 정책을 추진했다. 2020년 12월에 중국자동차협회는 SDV 연구 그룹을 결정하였고, 2021년 4월부터 자동차 메이커와 관련 기업들이 참가하여 SDV에 필요한 API를 정의하고 표준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API 표준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해서 만든 표준안이 실제 차량에 적용되고 있다. 중국 전기차 메이커인 BYD, Xpeng 등은 이미 테슬라처럼 SDV 차량을 구현하고 있다.
중국을 따라 배우는 일본
일본 기업은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필자는 7월 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SDV 서밋 2024에 참가했다. 약 300명이 모여서 정부 정책과 기업 전략 등을 듣는 자리였다. 세미나에 참가한 사람은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면서 전문가들의 발표들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일본 경제산업성 모빌리티 DX실의 책임자가 첫 번째 연사로 나와서 일본 정부의 모빌리티 디지털 전환(DX) 전략을 설명했다. 이 내용 중에 흥미로운 것은 배터리, 카메라 센서, 충전 장치 등과 자동차 간의 정보 전달 방식인 API를 표준화, 공용화시키겠다는 정책이었다. 일본 정부가 중국 자동차 산업 정책을 따라 한 것이다.
두 번째 연사로 나온 나고야대의 모빌리티 사회연구소 소장이자, SDV 전문가인 다카다 교수는 중국 자동차협회가 공개한 표준화된 API를 분석한 결과 앞으로 검토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오픈 SDV 이니셔티브’라는 기구를 발족하고 일본 자동차 메이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차량용 API 표준 사양을 만들어 내년 3월에 표준 사양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기업은 중국, 미국 신생기업과 비교하면 확실히 늦다. 하지만 무엇을 배우고 따라갈지를 정확하게 정해놓은 것 같다. 일본 메이커의 SDV는 앞으로 2년 이내에 그 실체가 보일 것 같다. 혼다와 소니의 합작사가 만든 차량이 2026년에 발매될 예정이고 토요타도 아린(Arene)이라는 차량용 OS를 2026년에 공개할 예정이다.
제조업이라는 것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항상 눈에 보이는 형상,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이 존재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에 과거 한국 제조업이 걸어온 길과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조직 구성원 간에 공통의 대상을 놓고 논의하기가 힘들다. 소프트웨어는 고도의 지적(知的) 작업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만질 수 없는 것이어서 폄하되어왔다.
이것은 기존 자동차 회사가 SDV라는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데 힘들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그래서 거의 모든 기존 자동차 메이커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공학의 차이와 일하는 방식을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로 간의 이해가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의 융합된 형태의 차량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제조업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다. 구성원 대부분이 각자 좁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면서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성장해왔다. 하지만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가 융합되어야 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영역을 뛰어넘는 사람이 필요하다.
자동차의 SDV화를 빠르게 성공시킨 회사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다. 규모가 작으면 일하는 업무 영역이 넓어진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보라. IT 전문가인지 우주선 발사 전문가인지 알기 힘들 정도로 그의 활동 영역은 넓다. 이럴 때일수록 업무 영역이 넓은 엔지니어를 발굴하고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자동차 정책은?
소프트웨어 퍼스트니, SDV니 하는 용어들은 결국 고객에게 좋은 가치를 가진 차량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종의 수단에 불과하다. 보통 인기 있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기 쉽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결과물을 계속 구성원과 공유하면서 구현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표는 원대할 수 있어도 수단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전기차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API 표준화를 실시했다. 일본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따라간다. 자동차 산업을 펼치는 한국 정부의 정책도 이웃 나라의 자동차 산업 정책처럼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과거 자동차는 전통적인 기계 산업이었다. 자동차 메이커는 말처럼 황소처럼 달리는 차량, 근육질의 차량을 만들었다. 이후 전기·전자 산업의 발전으로 기계 부품에 마이크로 칩을 장착하여 기계의 미세한 움직임을 제어하기 시작했다. 마치 근육을 조절하는 일종의 자율신경계처럼 말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기계 산업과 전자 산업과의 융합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때에도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 칩에 내장된 형태로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은 차량에 고성능 컴퓨터(HPC·High Performance Computer)가 장착되고 그곳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에 따라 차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능이 달라진다. 마치 스마트폰처럼 차량의 소프트웨어가 무선(無線)으로 업데이트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것을 우리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oftware Defined Vehicle), SDV라고 한다. 지금 자동차 산업은 기계에서 전자로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SW)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자동차 제품 개발 과정
2020년 토요타 자동차 사장은 ‘소프트웨어 퍼스트’라는 선언을 했다. 작년 10월에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여 ‘디지털 소프트웨어 개발센터’를 신설했다. 현대차도 모든 차종을 SDV로 전환할 것을 밝히고 올해 초 연구소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SDV, 소프트웨어 퍼스트라는 용어의 의미를 살피고 앞으로의 차량 개발에 있어서의 과제를 생각해보자.
SDV(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를 설명하기에 앞서 자동차 제품 개발 과정과 특징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새로운 용어일수록 자동차 산업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파악해야 흔들림 없는 개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메이커는 먼저 새로운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제품의 콘셉트(concept)를 정한다.
가령 새로운 소형차를 개발한다고 가정해보자. 상품기획부서가 ‘콤팩트한 도심형 자동차’라는 차량의 콘셉트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콘셉트를 만족시킬 차량의 기능들, 가령 연비(燃費), 승차감 등의 목표치를 정한다. 이것을 기능설계라고 부른다.
목표로 하는 연비를 만족시키기 위해 차량의 무게를 줄이고 엔진 효율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면 연구개발부서는 기존 차량 대비 무게를 50kg 줄이고, 엔진의 압축비를 5% 올리는 작업을 실시한다. 차량 무게를 줄이기 위해 차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동일한 사이즈지만 가벼운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 차량의 크기를 줄일 경우에도 가능한 한 큰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부품들의 크기를 줄이거나 부품 배치를 변경하는 작업들을 진행한다.
이처럼 엔지니어들은 제품이 갖춰야 할 기능(Functional Requirements)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구조물(부품들)의 설계 파라미터(Design Parameters), 즉 부품의 치수를 정하고 재질을 결정한다. 이 과정을 설계(設計)라고 한다. 설계란 무형의 욕구(기능)를 만족시키기 위한 유형의 구체적인 정보를 만드는 것으로, 설계의 아웃풋은 도면(圖面)이다. 과거에는 설계된 정보를 종이 위에 그렸지만 지금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디지털화해서 저장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다. 생산(生産)이란 이런 설계 정보를 실물(실제의 물건)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설계 변경의 연쇄 효과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 설계 프로세스(Design Process)가 만만치 않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여 사람을 태우고 2t의 중량물을 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물건이다.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와 직결되고 고속으로 이동하기에 인명 사고가 날 수 있다. 자동차 엔지니어는 환경과 교통사고라는 두 가지 문제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운전자의 안전만을 위한 차량이라면 탱크 같은 차량을 만들면 되지만, 연비는 당연히 나쁘다. 가볍게 만들기 위해 얇은 철판으로 차체를 만들면 사고가 났을 때 차가 마치 종이처럼 구겨질 것이다. 즉 안전과 연비라는 기능이 서로 상충(相衝)한다.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런 상충 문제를 안고 있지만, 자동차의 경우 그 정도가 타(他)제품에 비해 심하다. 특히 연비도 좋고 안전하며 가격까지 저렴해야 할 경우, 설계 파라미터가 서로 복잡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한 명의 설계자가 자신이 담당한 부품의 치수를 변경하면 그 부품과 연결된 다른 부품의 설계 또한 변경해야 한다.
이런 설계 변경의 연쇄 효과는 하이브리드 차량(HEV)이 전기차(BEV)보다 크다. 그래서 자동차를 개발할 때에는 개발 과정 중간중간에 그동안 설계한 정보를 다 같이 점검하고 난 뒤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런 방식을 워터폴(Waterfall) 방식이라 부른다. 마치 폭포수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이미지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처럼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인력 간의 긴밀한 상호협조가 요구된다. 운동 경기로 치자면 팀워크를 중시하는 축구 경기와 비슷하다. 필자는 현대자동차 경영연구소(KARI)에서 근무하다가 1년간(2014년 11월~2015년 10월) 남양 연구소로 파견 근무를 간 적이 있다. 그때 관찰한 바에 따르면, 차체 설계부의 팀워크가 가장 좋았다. 철판을 연결하여 3차원의 완결된 차체 구조를 만들어야 하기에 동료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 불가결하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설계는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자동차의 경우 만족해야 할 기능을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계적인 측면에서 자동차 설계는 기능 설계보다 구조 설계에 중심을 둔다. 심지어는 구조물을 다 만들고 난 뒤에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기능을 발견하기도 한다.
ECU–엔진제어장치에서 전자제어장치로
자동차에 전자 장치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된 1960년대부터다. 특히 미국 의회가 1970년 12월에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소위 머스키법(Muskie Act)을 통과시키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법은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을 5, 6년 내에 10분의 1로 줄이도록 요구했다.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는 엔진 점화 시기와 같은 값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전자 장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978년 GM이 엔진제어장치(ECU·Engine Control Unit)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ECU는 마치 도시락통같이 생긴 것으로 그 안에 각종 전자기기를 서로 연결시켜놓은 인쇄 회로 기판(PCB)이 들어갔다. 이후 전자 장치가 엔진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에어백 등을 제어하는 데도 사용되면서 ECU는 전자제어장치(Electric Control Unit)의 약어로 변했다. 전자 장치가 기계 부품을 제어하는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한때 서울대 입학시험에서 최고 커트라인을 자랑하던 제어계측공학과가 생긴 것이 바로 1978년이다.
여기서 제어의 특징을 살펴보자. 제어(Control)란 어떤 대상물을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다 보니 만족시켜야 하는 기능(목표치)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고 난 뒤 적절한 제어 이론을 논리회로로 구현하여 목표치를 달성한다. 이때 전자 장치의 경우 목표치인 기능과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구조(논리회로, 전자회로) 간의 대응관계가 기계 장치에 비해 비교적 명료하다.
고급차, 100여 개의 ECU 장착
 |
[그림1 상단]은 기계 부품 속에 들어간 전자 디바이스와 그 속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속 네모는 엔진, 브레이크, 에어백 등 자동차에서의 큰 기계 부품을 의미한다. 기계 부품은 덩치는 크지만 제어당하는 입장이고, 전자부품은 덩치는 작지만 제어를 하는 입장이다.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는 기계 부품에 마이크로 칩과 같은 전자 부품을 직접 장착하고 그 내부에는 제어하는 데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형태로 내장시킨다. 여기서 소프트웨어는 각 부품에 들어가는 특정 반도체에 맞춰 제작되었기에 수정하기 곤란하다.
전자제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설계는 [그림1 하단]처럼 기계→전자→소프트웨어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기계가 설계되지 않으면, 전자 장치의 설계를 진행할 수 없고, 전자 설계(가령 반도체 사양 결정)가 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를 짜기 힘든 구조임을 의미한다. 자동차의 경우 기계 부품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고 설계 난이도가 높아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개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도 주로 기계 공학 전공자이다.
하지만 고객의 니즈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엔진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에어백 등 전자 장치로 제어해야 할 부품이 많아졌다. 고급차의 경우 차량에 100여 개의 ECU가 장착되어 있다. 자동차에 전자 부품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새롭게 노출되기 시작했다.
인증시험 부정, 왜 일어나나
첫째, 전자 장치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양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ECU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생각해보자. 가령 운전자가 가속(加速)을 하기 위해 액셀을 밟았다고 하자. 그러면 액셀을 밟은 정도를 센서로 검출하고 차량 속도,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량을 고려하여 연비가 좋게 나오도록 가솔린을 엔진에 분사한다. 연비, 배출가스 등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래서 차량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길이 또한 늘어나, 2010년에는 약 1000만 행(行) 수준이었는데, 2020년에는 1억 행이 되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이 도입된 차는 3억~5억 행 수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양이 증가하면 에러가 생기기 쉽고 개발 비용이 증가한다. 자동차의 전장 부품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1970년에 5%, 2000년에 22%, 2010년에 25%로 상승했다. 그리고 2030년에는 5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참조 : 2023년, 하버드 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 Woven Planet-Designing Software for the Car of the Future)
둘째, 차량 개발 기간이 길어졌다. 만일 기계 설계에 결함이 발견되면, 전자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해야 하거나, 시간이 부족하여 목표로 하는 기능을 완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출시해야 한다.
올해 1월 일본 다이하쓰의 대규모 인증시험 부정 사건이 발견되었다. 여러 부정 사건 중 눈여겨볼 만한 것이 충돌 시험 시 에어백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시험에서의 부정이다. 인증 시험 시에 에어백을 제어할 수 있는 ECU를 완성시키지 못하자 타이머를 부착해서 에어백이 작동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 시간이 부족해서 부정한 방식으로 인증을 먼저 받고, 나중에 제대로 된 ECU를 장착한 것이다. 현재와 같은 개발 방식으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차량 개발을 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머스크, 무선으로 SW 업데이트해 문제 해결
 |
| 2016년 3월 31일 테슬라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자사의 모델3 자동차를 소개하는 머스크. 이듬해 모델3의 문제점을 지적당하자 머스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문제를 해결했다. 사진=AP/뉴시스 |
이처럼 각 부품이 서로 연계를 해서 구현하는 기능이 늘어나면서 [그림1]과 같이 기계에 단순히 전자 장치가 더해진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이제 자동차는 고도의 계산 능력을 가진 컴퓨터(HPC)가 요구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소프트웨어로 자동차의 개념을 바꾼 주인공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다. 우리는 흔히 테슬라를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테슬라는 2012년에 모델S를 출시하고, 2017년에 모델3를 판매하면서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테슬라의 차량은 배터리가 있는 전기차임과 동시에, 고도의 컴퓨팅 능력을 가지면서 차량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기능을 부가할 수 있는 차량이다. 이런 변화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일화가 있다.
미국에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s)》라는 자동차 평가 잡지가 있다. 2018년 이 잡지는 테슬라의 모델3가 포드의 픽업트럭 F-150보다 가볍지만, 제동거리는 더 길다면서 모델3의 구입을 추천하지 않았다.
이것을 본 일론 머스크는 그의 트윗(현재는 X)에 OTA로 제동거리를 더 짧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여기서 OTA는 오버 더 에어(Over the Air)의 약자로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기술을 말한다. 실제 일주일 만에 테슬라 차량은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모델3의 제동거리를 6m 짧게 만들었다(참조 : 시속 97km/h에서 정지까지의 거리 기준). 제동 장치는 자동차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데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버린 것이다. 결국 《컨슈머 리포트》는 모델3를 추천으로 변경했다.
주행·제동·조향 기능 업데이트되어야
 |
여기서 SDV란 용어를 다시 살펴보자. SDV(Software Defined Vehicle)란 고객에게 차량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차량을 의미한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단지 소프트웨어 양이 많다고 해서 SDV라고 부르지 않는다.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급차의 소프트웨어 길이는 이미 1억 행 수준이다. 소프트웨어의 양이 아니라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SDV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차량의 기본 기능인 주행(Go), 제동(Stop), 조향(Handling) 기능 등이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관련 기능만 업데이트하는 차량은 굳이 SDV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림2]는 SDV 차량에서 기계-전자-소프트웨어의 연결 관계(아키텍처)를 나타낸 것이다. 기존 차량은 기계 장치 내에 전자 장치가 있고, 그 속에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다. 하지만 SDV에서는 차량용 운영체제(OS)가 있다. OS란 응용 SW와 하드웨어(전자) 사이에서, 응용 SW 실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자원을 할당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OS는 정부의 기능과 비슷하다. 정부는 토지, 예산 등의 자원을 국방, 복지 등에 할당한다. 비슷하게 컴퓨터에서는 윈도, 리눅스와 같은 OS가 CPU(중앙처리 장치), 메모리와 같은 자원을 워드, 인터넷 등과 같은 응용 SW에 할당한다. 정부 조직에 국방부, 외교부가 있는 것처럼 컴퓨터 운영체제 안에는 파일 시스템 관리, 메모리 관리 등과 같은 기능별 관리 시스템이 있다.
이런 OS의 가장 큰 역할은 HW(하드웨어)와 SW(소프트웨어)를 분리시킨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도 컴퓨터처럼 보다 손쉽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HAL과 API
여기에서, HAL(하드웨어 추상화)과 API라는 2가지 용어를 추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HAL(Hardware Abstraction Layer)을 직역하면 하드웨어(전자HW) 추상화를 의미한다.
추상화란 말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이 개념을 부지불식간에 사용하고 있다. 가령 컴퓨터에서 워드 작업을 하고 난 뒤에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고 외부 저장 장치인 USB에 저장할 수도 있다. 실제 컴퓨터 내부에서는 2개의 하드웨어(하드디스크와 USB)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OS(운영체제)는 사용자가 그 차이를 전혀 느낄 수 없도록 만들어준다. 이것이 추상화(Abstraction)다. 이런 추상화가 이루어지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손쉽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일종의 신호 규칙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방향지시등으로 이동할 방향을 알려주거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등이 켜져서 뒤차에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런 종류의 신호는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운 주체들 사이에 정보 전달 방식으로 유용하다.
소프트웨어, 인터넷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네이버가 지도를 제공하면서 지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API 형태로 제공하면, 누구나 그것을 보고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앱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API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중국 전기차가 빠른 성장을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차량용 API의 표준화 정책 덕분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다.
일본, 텐스토렌트에 반도차 설계 기술자 파견
 |
| 텐스토렌트 CEO 짐 켈러. 사진=텐스토렌트 |
FSD 컴퓨터에는 반도체 칩의 사고·고장에 대비하여 2개의 FSD 칩이 들어가 있는데, 칩 하나당 데이터 처리 속도는 36TOPS(Tera Operations Per Second)이다. 1테라(Tera)는 1012(10의 12승)을 의미한다. 즉 36TOPS는 1초에 36조의 연산을 수행하는 반도체이다.
이 반도체 칩을 설계한 사람은 짐 켈러다. 그는 2016년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인 텐스토렌트(Tenstorrent)라는 스타트업 회사를 설립했고, 2023년에는 현대차와 삼성전자, LG전자가 투자를 했다. 일본은 올해 하반기부터 30~40대의 반도체 설계 기술자 200명을 선발하여 텐스토렌트에 파견을 보낸다고 한다. 바야흐로 자동차 회사가 운영체제도, 소프트웨어도, 반도체 설계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소프트웨어 퍼스트
 |
앞에서 기존 자동차의 개발 방식은 기계 부품→전자 부품(ECU)→소프트웨어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이 방식이 점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특히 하드웨어의 개발 기간에 비해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이 늘어나고, IT 산업의 발전 속도가 빨라 기존 자동차 메이커의 개발체제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퍼스트라는 개념이 나왔다.
[그림3]은 2023년 11월, 토요타 자동차의 SDV 관련 책임자인 무라타 겐이치(村田賢一)가 소프트웨어 퍼스트를 설명하는 내용 중 일부다. 그는 게이오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소니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OS 관련 일을 하다가, 2008년부터 토요타 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해온 사람이다.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전자회사에서 실무를 경험한 엔지니어를 곧잘 만날 수 있다. 시대가 변했음을 방증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는 [그림3]의 왼쪽에 표시한 것처럼 ① 차량이 필요로 하는 기능 요구사항을 먼저 정의하고 ② 정의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ECU 하드웨어를 선택한 뒤 ③ 각 ECU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④ ECU 간 통신을 하면서 기능을 평가하는 순서로 차량을 개발했다. 차량을 제어해야 할 양이 한정된 상황에서, 사용하는 ECU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이 방식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림3]의 오른쪽에 표시한 방식으로 개발 방식을 변경하였다. 먼저 ① 차량이 필요로 하는 기능 요구사항을 정의한 후에 ② 기능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소프트웨어의 전체 구조(아키텍처)를 먼저 설계하고 개발을 한다. ③ 단 ECU 하드웨어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가상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개발해나간다. 마지막으로 ④ SW가 들어갈 ECU 하드웨어를 선정하여 적용시킨다. 이렇게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SW가 업데이트될 것을 고려해 비용이 들더라도 충분히 여유 있는 ECU를 확보해서 사용한다.
국가별 SDV 전환 방식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자동차가 소프트웨어가 정의된 차량으로 바뀌면 어떤 이점이 생길지 간단히 정리해보자.
첫째, 소프트웨어 기능 개발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분리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쉽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고객 만족도를 올릴 수 있다.
셋째, 소프트웨어를 통해 각 사용자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자동차 메이커는 차량 판매 이후에도 소프트웨어 판매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 자동차 메이커는 이와 같은 SDV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중국, 정부 주도로 API 표준화
자동차가 SDV로의 전환을 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다르다. 기존 자동차 메이커와 신흥 전기차 메이커 또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혁신은 역시 슈퍼맨 방식이다. 일론 머스크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와 기존 자동차의 문제점을 보고 근본부터 바꿔버리는 방식이다. 중국은 정부의 여러 가지 산업 지원 정책과 함께 또 그 나름의 기술 중심 창업자가 나타나면서 SDV로의 전환을 이루어내고 있다. 일본은 경쟁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자국 기업과 정부 관료가 모여 토론을 하면서 하나씩 개선하는 방식이다.
중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중국 전기차 산업의 발전은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보조금 덕분이라고 알려져 있다. 6월 21일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15년 동안 2310억 달러(약 300조원)를 지원했다.
이런 보조금 이외에 산업 진흥을 위한 정교한 정책도 있었다. 먼저 중국에는 ‘시장과 기술의 맞교환’이라는 정책이 있는데 중국어로 ‘이시장환기술(以市場换技術)’이라고 한다. 이것은 1979년부터 구상되어, 1982년부터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1984년부터 중국 기술 발전을 가속화시킬 중요한 방침으로 확정되었다. 이 정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외국 기업에 중국의 시장을 내주면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대신 그 기업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을 진흥시키는 방식이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테슬라는 2019년 상하이에 공장을 짓고, 2020년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이후부터 중국의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가령 중국의 전기차 메이커 BYD는 2020년 한(漢)이라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면서 나름 독자적인 자동차 개발 방식을 정립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했다. 중국자동차협회(CAAM)는 테슬라 차량이 전기차임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API 표준화 정책을 추진했다. 2020년 12월에 중국자동차협회는 SDV 연구 그룹을 결정하였고, 2021년 4월부터 자동차 메이커와 관련 기업들이 참가하여 SDV에 필요한 API를 정의하고 표준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API 표준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해서 만든 표준안이 실제 차량에 적용되고 있다. 중국 전기차 메이커인 BYD, Xpeng 등은 이미 테슬라처럼 SDV 차량을 구현하고 있다.
중국을 따라 배우는 일본
일본 기업은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필자는 7월 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SDV 서밋 2024에 참가했다. 약 300명이 모여서 정부 정책과 기업 전략 등을 듣는 자리였다. 세미나에 참가한 사람은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면서 전문가들의 발표들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일본 경제산업성 모빌리티 DX실의 책임자가 첫 번째 연사로 나와서 일본 정부의 모빌리티 디지털 전환(DX) 전략을 설명했다. 이 내용 중에 흥미로운 것은 배터리, 카메라 센서, 충전 장치 등과 자동차 간의 정보 전달 방식인 API를 표준화, 공용화시키겠다는 정책이었다. 일본 정부가 중국 자동차 산업 정책을 따라 한 것이다.
두 번째 연사로 나온 나고야대의 모빌리티 사회연구소 소장이자, SDV 전문가인 다카다 교수는 중국 자동차협회가 공개한 표준화된 API를 분석한 결과 앞으로 검토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오픈 SDV 이니셔티브’라는 기구를 발족하고 일본 자동차 메이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차량용 API 표준 사양을 만들어 내년 3월에 표준 사양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기업은 중국, 미국 신생기업과 비교하면 확실히 늦다. 하지만 무엇을 배우고 따라갈지를 정확하게 정해놓은 것 같다. 일본 메이커의 SDV는 앞으로 2년 이내에 그 실체가 보일 것 같다. 혼다와 소니의 합작사가 만든 차량이 2026년에 발매될 예정이고 토요타도 아린(Arene)이라는 차량용 OS를 2026년에 공개할 예정이다.
제조업이라는 것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항상 눈에 보이는 형상,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이 존재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에 과거 한국 제조업이 걸어온 길과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조직 구성원 간에 공통의 대상을 놓고 논의하기가 힘들다. 소프트웨어는 고도의 지적(知的) 작업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만질 수 없는 것이어서 폄하되어왔다.
이것은 기존 자동차 회사가 SDV라는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데 힘들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그래서 거의 모든 기존 자동차 메이커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공학의 차이와 일하는 방식을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로 간의 이해가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의 융합된 형태의 차량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제조업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다. 구성원 대부분이 각자 좁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면서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성장해왔다. 하지만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가 융합되어야 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영역을 뛰어넘는 사람이 필요하다.
자동차의 SDV화를 빠르게 성공시킨 회사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다. 규모가 작으면 일하는 업무 영역이 넓어진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보라. IT 전문가인지 우주선 발사 전문가인지 알기 힘들 정도로 그의 활동 영역은 넓다. 이럴 때일수록 업무 영역이 넓은 엔지니어를 발굴하고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자동차 정책은?
소프트웨어 퍼스트니, SDV니 하는 용어들은 결국 고객에게 좋은 가치를 가진 차량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종의 수단에 불과하다. 보통 인기 있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기 쉽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결과물을 계속 구성원과 공유하면서 구현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표는 원대할 수 있어도 수단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전기차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API 표준화를 실시했다. 일본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따라간다. 자동차 산업을 펼치는 한국 정부의 정책도 이웃 나라의 자동차 산업 정책처럼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