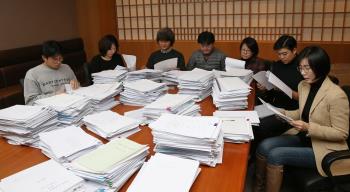⊙ 勞組의 과도한 자기 이익 추구, 청년실업·임금 불평등으로 이어져
⊙ 규제는 공무원들의 지대추구 수단으로 전락… 한국의 규제의 質 指數는 OECD 평균치의 70% 수준
⊙ 적폐청산·민족주의 미명하의 권력독점 추구도 ‘정치적 地代’추구 행위
權五律
1936년생. 서울대 상과대학 졸업. 캐나다 맥매스터대학 경제학 박사 / 한국은행 조사부 근무, 캐나다 연방재무부 조세정책국 수석조정관, 서울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캐나다 리자이나대학 경영대학 교수, 호주 국립그리피스대학 석좌교수, 캐나다 NET-FIVE 텔레콤 부사장 역임. 現 캐나다 사이몬프레이저대학 경영대 겸임교수
⊙ 규제는 공무원들의 지대추구 수단으로 전락… 한국의 규제의 質 指數는 OECD 평균치의 70% 수준
⊙ 적폐청산·민족주의 미명하의 권력독점 추구도 ‘정치적 地代’추구 행위
權五律
1936년생. 서울대 상과대학 졸업. 캐나다 맥매스터대학 경제학 박사 / 한국은행 조사부 근무, 캐나다 연방재무부 조세정책국 수석조정관, 서울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캐나다 리자이나대학 경영대학 교수, 호주 국립그리피스대학 석좌교수, 캐나다 NET-FIVE 텔레콤 부사장 역임. 現 캐나다 사이몬프레이저대학 경영대 겸임교수

- 민노총은 지난 7월 18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갖고 노동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등을 외쳤다. 사진=조선DB
경제는 제도에 의해 발전한다. 애덤 스미스는 재산권과 경쟁의 공정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어야만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여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것도 명예혁명 후 이런 제도가 제일 먼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세계화·지식정보화 시대의 경제 발전은 창의력에 좌우된다. 창의력을 개발하고 이를 혁신기업에 자유로이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제가 성장한다.
반면 제도가 불합리하거나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게 되면 경제 발전은 저해된다. 애덤 스미스는 제도가 제 역할을 못 하면 무엇보다도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지대(地代·rent·부동산과 같이 생산요소의 공급이 제한되거나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지 않아서 공급자가 기회비용보다 더 크게 얻는 수입)추구 행위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침체된다고 했다. 이것은 지대추구가 경제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유도하고, 경제제도의 개선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대추구는 경제 침체뿐 아니라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 지대추구는 사회갈등을 높이며 사회 신뢰를 저하시킨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을 방해하고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침체나 저(低)성장을 초래한다. 경제 침체는 경제적 불공평을 심화시키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높여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서 경제 침체를 더욱 악화시킨다. 따라서 지대추구가 만연하면 경제와 사회가 악순환(惡循環)에 빠지게 되어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불행히도 한국 사회는 최근 들어 여러 방면에서 지대추구가 만연하고 있다. 그런 만큼 한국 사회나 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의 지대추구 세력은 대기업(재벌), 노동조합, 관료, 정치 권력 등 다양하다.
대기업에 대한 사회신뢰도, 34%에 불과
대기업(재벌)들의 지대추구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가 후진적(後進的)이어서 재벌들의 소유·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경제력 집중은 OECD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아졌으며, 경영의 투명성이 낮은 데서 발생한다. 이런 제도와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부패가 유발되어 대기업들의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2009~2017년 국민의 73%가 ‘대기업이 부패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의 지대추구는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의 하청 단가 후려치기, 대가 지불 지연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OECD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윤율과 평균임금 수준은 1980년경에는 대기업의 그것과 비슷했지만, 최근에는 각각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생산성도 대기업의 55%에서 33%로 떨어졌다.
대기업들의 과도한 지대추구 현상은 기업에 대한 사회신뢰를 추락시킨다. 한국행정연구원 조사(2017년)에 의하면 기업에 대한 한국의 사회신뢰도는 OECD 34개국 중 약 30번째로 낮다. IMD(국제경영대학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2017년 보고에 의하면 대기업에 대한 사회신뢰도는, 그 이전 5년간 평균 34%에 불과하다.
勞組의 地代추구, 청년층에게 피해
대기업만 지대추구 세력인 것은 아니다. 약자(弱者)들의 대변자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노동조합 역시 거대한 지대추구 세력 중 하나이다. 노조(勞組)는 조합원의 생산성 향상 수준을 상회하는 과도한 임금 상승을 유도하는 지대추구를 한다. 그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희생된다. 2002~2017년 근로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 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비율은 2002년 67%에서 2014년 55%로 하락했다.
노조의 임금 인상 관철 수단도 문제다. 불법파업, 회사점거, 기물파괴, 공권력(경찰)에 대한 폭력 행사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런 일들은 노사관계의 형평성 부족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비롯된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과 IMD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OECD 국가 중 각각 6번째와 12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MD에 의하면 한국의 해고비용은 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의 이런 과도한 권력은 지대추구 수단으로 활용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노조 간부들의 부패로 귀결된다. 직원 채용을 둘러싼 노조 간부들의 비리, 노조원 가족 간의 직장 대물림 등이 그 예이다.
그 결과 노사(勞使) 간, 노노(勞勞) 간 갈등과 불화, 사회갈등이 조장되며 노조에 대한 사회 신뢰를 추락시킨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7년 조사에 의하면 노조에 대한 사회 신뢰는 그 이전 5년간 평균 39%에 불과했다.
노조의 지대추구 수단인 강성(强性) 불법 노동쟁의와 그에 따른 임금인상으로 국내 투자는 줄어들고, 기업의 해외 투자가 증가했다. 생산성과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고용률과 고용의 질(質)이 떨어졌다. 그 피해는 특히 청년층에게 돌아가고 있다. OECD의 2018년 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OECD 28번째이고,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들은 세 번째로 높다.
노조의 지대추구 결과는 임금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정규-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의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도시 가구소득의 89%를 차지하는 임금불평등은 소득불평등의 제일 큰 원인이 된다.
소득불평등은 국민의 건강과 교육수준을 낮추어 인적자원 개발을 저해하고, 정치·경제적 불안을 초래하여 투자를 저해하며, 사회 갈등을 증가시키고 사회 신뢰를 저하시켜, 사회안전망 구축을 어렵게 한다. 이런 경제·사회적 영향으로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노조의 지대추구 행위, 공권력 위에 군림하는 것 같은 폭력 불법시위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보면, 노조는 한국이 선진경제 사회로 진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공무원들의 地代추구 수단이 되어버린 규제
공무원도 무시할 수 없는 지대추구 세력이다. 공무원의 지대추구는 대개 규제를 통해 발생한다. 특히 규제가 많고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없어 규제의 질(質)이 낮을수록, 또 기존 기업보다 신(新)기업, 특히 벤처기업을 설립할 때 더 많이 생긴다. 2017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사업가의 3분의 2가 규제가 과하고 불투명하며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裁量權)이 너무 많다고 응답했다. 세계은행의 2017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규제의 질 지수(指數)는 OECD 평균치의 70%밖에 안 되고, 순위는 회원 국가 중 13번째로 낮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복잡한 규제와 거기에서 비롯되는 재량권을 유지하려 한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생래적으로 규제개혁을 꺼린다. 현재의 규제 체제하에서 지대추구를 하려는 기득권자들도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힘을 보탠다.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R&D) 지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 2006~2016년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특허권 신청 수(patent applications)에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국민소득이나 인구에 비하면 한국의 신청 수는 세계 최다(最多)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들이 산업적으로 활용되어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과다한 규제와 공무원들의 지대추구 때문이다. 2017년 IMD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4번째로 어렵고, 회사를 설립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11번째로 높다.
지대추구는 소위 ‘도둑정치(kleptoc racy)’에서도 발생한다. ‘도둑정치’란 러시아와 같은 독재국가에서 공권력을 사용하여 공적(公的) 자산을 약탈하여 사유화(私有化)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도 과거 몇몇 대통령이나 그들의 측근이 이런 식의 정치를 했다는 평가가 있다. 지금은 그런 행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전관예우(前官禮遇)도 지대추구의 한 양상이다.
권력 독점 시도도 地代추구
‘정치적 지대추구’도 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치제도를 바꾸면서 권력 독점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도 일종의 지대추구다. 독재자는 ‘적폐청산’이니 ‘민족주의’니 하는 미명하에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는 생각으로 역사를 다시 써서 자신들의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려 한다.
한국의 정치제도는 문화적으로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고, 정치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정치제도하에서는 권력을 잡기 위하여 ‘도둑정치’를 하거나 부패하기 쉽다. 일단 권력을 잡으면 소위 ‘부패척결’이니 ‘적폐청산’ 등을 이유로 정치제도를 바꾸면서 권력을 유지하려 든다.
이런 공권력이나 관료의 지대추구는 공공부문의 부패로 나타난다.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는 높은 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2006~2017년 국민의 60% 정도가 공공부문이 부패했다고 믿고 있다. 2017년 세계은행 보고에 의하면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가 2000~2016년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러 형태의 공권력과 관료의 지대추구는 사회정의를 저해하고 국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정부 및 정치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7년 조사에 의하면 그 이전 5년간 중앙정부, 국회, 법원에 대한 사회신뢰도가 평균 28.0%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국회에 대한 신뢰는 15.5%에 불과했다. OECD 보고서(2017년)에 의하면 그 이전 4년간 정부에 대한 사회신뢰도가 한국은 26.3%로 OECD 평균의 62%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OECD 34개 국가 중 5번째로 낮은 것이었다.
중국보다 낮은 對人신뢰
이처럼 대기업·노조·공공부문의 지대추구 행위는 부패로 이어지며 한국의 경제·사회 및 고용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러 국제기구(WBG·IMD·WEF·TI)의 측정에 의하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OECD 국가 중 최상층에 속한다.
각 분야에 만연한 지대추구와 부패는 사회 전체의 준법(遵法)정신을 저하시킨다. 세계은행의 2017년 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준법정신은 OECD 국가 중 8번째로 낮다. 그러다 보니 신뢰 관련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2000~2013년간 위증죄·무고죄·사기죄가 각각 3배, 2배, 54배로 증가했다. 인구를 감안하면 한국의 사기죄 건수는 일본의 165배이다. 사기 피해액은 43조원으로 한국 GDP의 3%에 해당한다.
지대추구, 부패, 그리고 낮은 준법정신은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2014년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5% 이상이 정당 간, 이념 간, 노사 간, 빈부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회 갈등은 사회 신뢰를 저하시킨다. 2015년 세계가치조사(WVS)에 의하면 한국의 대인 간 신뢰도는 1983년 36.0%에서 2012년에는 26.5%로 떨어졌다. 이것은 북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이웃인 일본·중국·홍콩·대만의 수준보다 낮다. 대인 간 신뢰 감소로 민사소송은 1990년에 300만 건에서 2016년에 700만 건으로 연(年) 5.1%씩 증가했다(KOSIS 2018). 이는 인구를 감안하면 일본보다 10배나 높은 것이다.
이런 ‘총체적 불신 사회’에 살다 보니 국민의 행복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2012~2019년 한국의 행복지수는 156개 조사대상국 중 평균 53번째이다.
이런 여건하에서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 2017년 한국의 사회발전지수는 OECD 국가 중 26번째로 평가되었다. 2016년에 나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OECD 보고에 의하면 사회발전지수로 곧잘 사용되는 사회통합지수가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층에 속한다.
地代추구,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져
지대추구나 부패에서 비롯되는 사회갈등은 경제정책 시행, 사회간접자본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어렵게 하고 정치 불안을 높여 경제 발전을 어렵게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의 측정에 의하면 사회갈등을 10% 낮추면 한국의 1인당 GDP가 매년 1.4%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사회 신뢰의 저하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협력·협동을 저해하고 거래비용을 높인다. 투자,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를 감소시키고,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노동의 분업과 전문화를 저해하며, 규제 증가를 유도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다. 사회 신뢰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측정하는 많은 연구가 대개 대인 간 신뢰도를 10%포인트 높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0%포인트 정도 증가한다고 한다.
그로 인한 경제 부진으로 더욱 피해를 보게 되는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확대되면 이는 다시 사회 갈등과 사회 불신으로 연결되고 경제·사회 발전을 둔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2011~201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0%로 낮아졌다. 잠재성장률도 1990년대 7.7%에서 2000년대 4.4%로 떨어졌다. 2019년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잠재성장률은 2019~2022년 2.5%, 2023~2030년에 2.3%가 되었다가 2030년대는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文在寅)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형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세 가지이다. 제도개혁에는 주안점이 없고, 근시안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다분하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소득증가가 소비확대, 기업투자확대, 다시 국민소득증가로 이어지는 포스트케인지언 이론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포스트케인지언 이론도 건전한 제도 정립을 전제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정책 실행의 역(逆)반응을 최소화한다는 ‘점진주의(incrementalism)’의 원칙에 위배된다.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2020년에 1만원으로 올린다는 목표로 취임 첫해에 16.4%, 둘째 해에 10.9%나 올렸다. 게다가 일주일간 최장 근로시간도 5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0.3%나 내렸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큰 부작용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비용증가를 어느 정도 보전해준다고 해도, 그런 불안정한 정부보조를 믿으면서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용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 한편 최저임금 노동자는 일자리와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더 곤란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협약 임금 상승을 유도하고 생산성 증가 없는 인위적 임금 상승은 경제 전체의 비용을 증가시켜, 한국 경제 수출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또 생산성 향상이 따르지 않는 인위적 임금 상승은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내 자본의 해외직접투자나 해외위탁(outsourcing)을 증가시켜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文 정부 노동정책, 불공정 조장
한편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노동시장 개혁 없이 공무원 증가와 정부규제와 압력으로 공공부문이나 관련 민간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정략적인 미봉책은 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기는 어렵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무원 수는 인구증가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위적 공무원 수 증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사회주의적 고용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부당함은 1990년대 초 사회주의 몰락으로 증명된 바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은 그들에게 생산성과 무관하게 임금을 약 두 배로 올려주는 것과 같아서 경제비용이 높아진다. 공무원을 증원하거나 봉급을 인상하면 민간부문의 세금이 오른다. 직장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고, 규제개혁이나 철폐는 더 어렵게 된다. 이런 이유로 공무원이 한 명 늘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1.5개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공정경제’ 기조를 무너트린다. 노조임원의 부패, 빈번한 불법 노동쟁의는 정부가 노사 간의 중재 역할을 공정하게 못 하고 있으며, 제도나 정책이 노동계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원-비노조원,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및 다른 근로조건의 양극화(兩極化)가 심화되어 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서 이러한 불공정한 노동시장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임금의 양극화, 나아가서 소득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사회 신뢰를 추락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또 정부나 관련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득권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젊은층의 기회를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민간기업에서 생산성에 무관한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도 기득권자들이다. 이런 과도한 임금인상은 생산비를 증가시킨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중소기업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취업준비생들이 더 어렵게 된다. 이렇게 공정가치를 떨어트리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고용기회 증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과 사회불신을 조장할 뿐이다.⊙
세계화·지식정보화 시대의 경제 발전은 창의력에 좌우된다. 창의력을 개발하고 이를 혁신기업에 자유로이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제가 성장한다.
반면 제도가 불합리하거나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게 되면 경제 발전은 저해된다. 애덤 스미스는 제도가 제 역할을 못 하면 무엇보다도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지대(地代·rent·부동산과 같이 생산요소의 공급이 제한되거나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지 않아서 공급자가 기회비용보다 더 크게 얻는 수입)추구 행위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침체된다고 했다. 이것은 지대추구가 경제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유도하고, 경제제도의 개선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대추구는 경제 침체뿐 아니라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 지대추구는 사회갈등을 높이며 사회 신뢰를 저하시킨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을 방해하고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침체나 저(低)성장을 초래한다. 경제 침체는 경제적 불공평을 심화시키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높여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서 경제 침체를 더욱 악화시킨다. 따라서 지대추구가 만연하면 경제와 사회가 악순환(惡循環)에 빠지게 되어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불행히도 한국 사회는 최근 들어 여러 방면에서 지대추구가 만연하고 있다. 그런 만큼 한국 사회나 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의 지대추구 세력은 대기업(재벌), 노동조합, 관료, 정치 권력 등 다양하다.
대기업에 대한 사회신뢰도, 34%에 불과
대기업(재벌)들의 지대추구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가 후진적(後進的)이어서 재벌들의 소유·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경제력 집중은 OECD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아졌으며, 경영의 투명성이 낮은 데서 발생한다. 이런 제도와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부패가 유발되어 대기업들의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2009~2017년 국민의 73%가 ‘대기업이 부패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의 지대추구는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의 하청 단가 후려치기, 대가 지불 지연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OECD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윤율과 평균임금 수준은 1980년경에는 대기업의 그것과 비슷했지만, 최근에는 각각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생산성도 대기업의 55%에서 33%로 떨어졌다.
대기업들의 과도한 지대추구 현상은 기업에 대한 사회신뢰를 추락시킨다. 한국행정연구원 조사(2017년)에 의하면 기업에 대한 한국의 사회신뢰도는 OECD 34개국 중 약 30번째로 낮다. IMD(국제경영대학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2017년 보고에 의하면 대기업에 대한 사회신뢰도는, 그 이전 5년간 평균 34%에 불과하다.
勞組의 地代추구, 청년층에게 피해
대기업만 지대추구 세력인 것은 아니다. 약자(弱者)들의 대변자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노동조합 역시 거대한 지대추구 세력 중 하나이다. 노조(勞組)는 조합원의 생산성 향상 수준을 상회하는 과도한 임금 상승을 유도하는 지대추구를 한다. 그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희생된다. 2002~2017년 근로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이 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비율은 2002년 67%에서 2014년 55%로 하락했다.
노조의 임금 인상 관철 수단도 문제다. 불법파업, 회사점거, 기물파괴, 공권력(경찰)에 대한 폭력 행사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런 일들은 노사관계의 형평성 부족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비롯된다.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과 IMD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OECD 국가 중 각각 6번째와 12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MD에 의하면 한국의 해고비용은 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의 이런 과도한 권력은 지대추구 수단으로 활용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노조 간부들의 부패로 귀결된다. 직원 채용을 둘러싼 노조 간부들의 비리, 노조원 가족 간의 직장 대물림 등이 그 예이다.
그 결과 노사(勞使) 간, 노노(勞勞) 간 갈등과 불화, 사회갈등이 조장되며 노조에 대한 사회 신뢰를 추락시킨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7년 조사에 의하면 노조에 대한 사회 신뢰는 그 이전 5년간 평균 39%에 불과했다.
노조의 지대추구 수단인 강성(强性) 불법 노동쟁의와 그에 따른 임금인상으로 국내 투자는 줄어들고, 기업의 해외 투자가 증가했다. 생산성과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고용률과 고용의 질(質)이 떨어졌다. 그 피해는 특히 청년층에게 돌아가고 있다. OECD의 2018년 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OECD 28번째이고,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들은 세 번째로 높다.
노조의 지대추구 결과는 임금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정규-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의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도시 가구소득의 89%를 차지하는 임금불평등은 소득불평등의 제일 큰 원인이 된다.
소득불평등은 국민의 건강과 교육수준을 낮추어 인적자원 개발을 저해하고, 정치·경제적 불안을 초래하여 투자를 저해하며, 사회 갈등을 증가시키고 사회 신뢰를 저하시켜, 사회안전망 구축을 어렵게 한다. 이런 경제·사회적 영향으로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노조의 지대추구 행위, 공권력 위에 군림하는 것 같은 폭력 불법시위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보면, 노조는 한국이 선진경제 사회로 진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공무원들의 地代추구 수단이 되어버린 규제
 |
| 비대한 정부와 규제는 공무원들이 지대추구를 하는 토양이 되고 있다. |
공무원들은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복잡한 규제와 거기에서 비롯되는 재량권을 유지하려 한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생래적으로 규제개혁을 꺼린다. 현재의 규제 체제하에서 지대추구를 하려는 기득권자들도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힘을 보탠다.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R&D) 지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 2006~2016년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특허권 신청 수(patent applications)에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국민소득이나 인구에 비하면 한국의 신청 수는 세계 최다(最多)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들이 산업적으로 활용되어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과다한 규제와 공무원들의 지대추구 때문이다. 2017년 IMD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4번째로 어렵고, 회사를 설립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11번째로 높다.
지대추구는 소위 ‘도둑정치(kleptoc racy)’에서도 발생한다. ‘도둑정치’란 러시아와 같은 독재국가에서 공권력을 사용하여 공적(公的) 자산을 약탈하여 사유화(私有化)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도 과거 몇몇 대통령이나 그들의 측근이 이런 식의 정치를 했다는 평가가 있다. 지금은 그런 행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전관예우(前官禮遇)도 지대추구의 한 양상이다.
권력 독점 시도도 地代추구
‘정치적 지대추구’도 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치제도를 바꾸면서 권력 독점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도 일종의 지대추구다. 독재자는 ‘적폐청산’이니 ‘민족주의’니 하는 미명하에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는 생각으로 역사를 다시 써서 자신들의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려 한다.
한국의 정치제도는 문화적으로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고, 정치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정치제도하에서는 권력을 잡기 위하여 ‘도둑정치’를 하거나 부패하기 쉽다. 일단 권력을 잡으면 소위 ‘부패척결’이니 ‘적폐청산’ 등을 이유로 정치제도를 바꾸면서 권력을 유지하려 든다.
이런 공권력이나 관료의 지대추구는 공공부문의 부패로 나타난다.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는 높은 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2006~2017년 국민의 60% 정도가 공공부문이 부패했다고 믿고 있다. 2017년 세계은행 보고에 의하면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가 2000~2016년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러 형태의 공권력과 관료의 지대추구는 사회정의를 저해하고 국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정부 및 정치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7년 조사에 의하면 그 이전 5년간 중앙정부, 국회, 법원에 대한 사회신뢰도가 평균 28.0%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국회에 대한 신뢰는 15.5%에 불과했다. OECD 보고서(2017년)에 의하면 그 이전 4년간 정부에 대한 사회신뢰도가 한국은 26.3%로 OECD 평균의 62%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OECD 34개 국가 중 5번째로 낮은 것이었다.
중국보다 낮은 對人신뢰
이처럼 대기업·노조·공공부문의 지대추구 행위는 부패로 이어지며 한국의 경제·사회 및 고용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러 국제기구(WBG·IMD·WEF·TI)의 측정에 의하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OECD 국가 중 최상층에 속한다.
각 분야에 만연한 지대추구와 부패는 사회 전체의 준법(遵法)정신을 저하시킨다. 세계은행의 2017년 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준법정신은 OECD 국가 중 8번째로 낮다. 그러다 보니 신뢰 관련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2000~2013년간 위증죄·무고죄·사기죄가 각각 3배, 2배, 54배로 증가했다. 인구를 감안하면 한국의 사기죄 건수는 일본의 165배이다. 사기 피해액은 43조원으로 한국 GDP의 3%에 해당한다.
지대추구, 부패, 그리고 낮은 준법정신은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2014년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5% 이상이 정당 간, 이념 간, 노사 간, 빈부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회 갈등은 사회 신뢰를 저하시킨다. 2015년 세계가치조사(WVS)에 의하면 한국의 대인 간 신뢰도는 1983년 36.0%에서 2012년에는 26.5%로 떨어졌다. 이것은 북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이웃인 일본·중국·홍콩·대만의 수준보다 낮다. 대인 간 신뢰 감소로 민사소송은 1990년에 300만 건에서 2016년에 700만 건으로 연(年) 5.1%씩 증가했다(KOSIS 2018). 이는 인구를 감안하면 일본보다 10배나 높은 것이다.
이런 ‘총체적 불신 사회’에 살다 보니 국민의 행복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2012~2019년 한국의 행복지수는 156개 조사대상국 중 평균 53번째이다.
이런 여건하에서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 2017년 한국의 사회발전지수는 OECD 국가 중 26번째로 평가되었다. 2016년에 나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OECD 보고에 의하면 사회발전지수로 곧잘 사용되는 사회통합지수가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층에 속한다.
地代추구,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져
지대추구나 부패에서 비롯되는 사회갈등은 경제정책 시행, 사회간접자본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어렵게 하고 정치 불안을 높여 경제 발전을 어렵게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의 측정에 의하면 사회갈등을 10% 낮추면 한국의 1인당 GDP가 매년 1.4%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사회 신뢰의 저하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협력·협동을 저해하고 거래비용을 높인다. 투자,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를 감소시키고,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노동의 분업과 전문화를 저해하며, 규제 증가를 유도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다. 사회 신뢰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측정하는 많은 연구가 대개 대인 간 신뢰도를 10%포인트 높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0%포인트 정도 증가한다고 한다.
그로 인한 경제 부진으로 더욱 피해를 보게 되는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확대되면 이는 다시 사회 갈등과 사회 불신으로 연결되고 경제·사회 발전을 둔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2011~201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0%로 낮아졌다. 잠재성장률도 1990년대 7.7%에서 2000년대 4.4%로 떨어졌다. 2019년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잠재성장률은 2019~2022년 2.5%, 2023~2030년에 2.3%가 되었다가 2030년대는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文在寅)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형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세 가지이다. 제도개혁에는 주안점이 없고, 근시안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다분하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소득증가가 소비확대, 기업투자확대, 다시 국민소득증가로 이어지는 포스트케인지언 이론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포스트케인지언 이론도 건전한 제도 정립을 전제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정책 실행의 역(逆)반응을 최소화한다는 ‘점진주의(incrementalism)’의 원칙에 위배된다.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2020년에 1만원으로 올린다는 목표로 취임 첫해에 16.4%, 둘째 해에 10.9%나 올렸다. 게다가 일주일간 최장 근로시간도 5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0.3%나 내렸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큰 부작용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비용증가를 어느 정도 보전해준다고 해도, 그런 불안정한 정부보조를 믿으면서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용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 한편 최저임금 노동자는 일자리와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더 곤란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협약 임금 상승을 유도하고 생산성 증가 없는 인위적 임금 상승은 경제 전체의 비용을 증가시켜, 한국 경제 수출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또 생산성 향상이 따르지 않는 인위적 임금 상승은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내 자본의 해외직접투자나 해외위탁(outsourcing)을 증가시켜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文 정부 노동정책, 불공정 조장
 |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발생했다. |
인위적 공무원 수 증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사회주의적 고용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부당함은 1990년대 초 사회주의 몰락으로 증명된 바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은 그들에게 생산성과 무관하게 임금을 약 두 배로 올려주는 것과 같아서 경제비용이 높아진다. 공무원을 증원하거나 봉급을 인상하면 민간부문의 세금이 오른다. 직장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고, 규제개혁이나 철폐는 더 어렵게 된다. 이런 이유로 공무원이 한 명 늘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1.5개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공정경제’ 기조를 무너트린다. 노조임원의 부패, 빈번한 불법 노동쟁의는 정부가 노사 간의 중재 역할을 공정하게 못 하고 있으며, 제도나 정책이 노동계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원-비노조원,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및 다른 근로조건의 양극화(兩極化)가 심화되어 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서 이러한 불공정한 노동시장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임금의 양극화, 나아가서 소득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사회 신뢰를 추락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또 정부나 관련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득권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젊은층의 기회를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민간기업에서 생산성에 무관한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도 기득권자들이다. 이런 과도한 임금인상은 생산비를 증가시킨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중소기업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취업준비생들이 더 어렵게 된다. 이렇게 공정가치를 떨어트리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고용기회 증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과 사회불신을 조장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