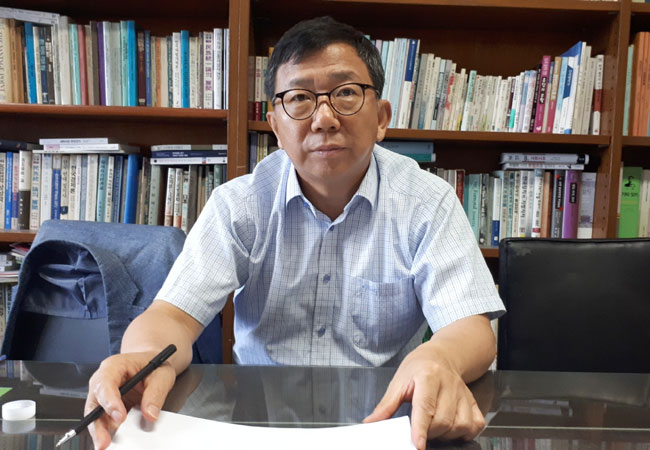⊙ “일본, 더 이상 관대함을 베풀 수 있는 강대국 아니야… ‘과거와 연관된 사죄·반성은 여기서 고리를 끊자’는 의지 강해”
⊙ “아베,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인정하면서 위안부 합의해줬는데, 그걸 엎어버리니 앵거(분노)지수 폭발”
⊙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청구권 문제 검토 문서는 法理論과 政策論 혼재… 개인청구권 소멸한 건 아니지만, 추궁하지는 않겠다는 것”
⊙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自害的 행위… 대항카드 못 돼”
⊙ “한국이 일방적으로 식민지배 불법성, 배상포기, 피해자 국내 구제 선언하는 게 가장 좋은 해법”
李元德
1962년생.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일본 도쿄대 국제관계학 박사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피츠버그대학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일본 도쿄대 대학원 객원교수 역임 / 現 국민대 글로벌인문·지역대 일본학과 교수
⊙ “아베,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인정하면서 위안부 합의해줬는데, 그걸 엎어버리니 앵거(분노)지수 폭발”
⊙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청구권 문제 검토 문서는 法理論과 政策論 혼재… 개인청구권 소멸한 건 아니지만, 추궁하지는 않겠다는 것”
⊙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自害的 행위… 대항카드 못 돼”
⊙ “한국이 일방적으로 식민지배 불법성, 배상포기, 피해자 국내 구제 선언하는 게 가장 좋은 해법”
李元德
1962년생.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일본 도쿄대 국제관계학 박사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피츠버그대학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일본 도쿄대 대학원 객원교수 역임 / 現 국민대 글로벌인문·지역대 일본학과 교수
한일(韓日)관계가 악화일로(惡化一路)를 달리고 있다. 문재인(文在寅) 정권 출범 후 화해치유재단의 해산과 2015년 위안부 합의 파기로 삐걱거리기 시작한 양국 관계는 작년에 있었던 관함식(觀艦式) 욱일기(旭日旗) 파문, 양국 해군 간 화기(火器)관제레이더 사건을 거치며 계속 나빠져왔다. 급기야 대법원의 징용공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및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 배제로 맞대응하면서, 양국 관계는 요란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정부·여당은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라며 전고(戰鼓)를 울리고 있다. 그에 선동된 많은 국민이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양 일본 상품 불매(不買)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1965년 한일 국교(國交)정상화 이후 최대의 위기, 혹은 ‘1965 체제의 해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일 간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듣기 위해 이원덕(李元德・57)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를 만났다. 이 교수는 한일관계에 대해 가장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로 꼽힌다.
‘韓日 간 攻守전환’
―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육영수 여사 암살, 김대중 납치사건, 일본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 문제 등으로 시끄러운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한일 양국이 서로 지지 않겠다면서 난타전(亂打戰)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양국 간의 싸움은 대체로 비대칭(非對稱)이었습니다. 한국이 과열양상을 보이더라도 일본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지난 50년 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실상의 경제보복-‘아베의 경제보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은 무척 이례적(異例的)인 일입니다. 2010년 중일(中日) 간 센가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 당시 중국이 희토류(希土類)를 무기화(武器化)한 것을 제외하면, 동아시아에서는 정경분리(政經分離)에 대한 규범이 어느 정도 살아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이 무역보복이라는 칼을 뽑은 것은 일본 외교사에서도 ‘역사적’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원덕 교수가 지난 7월 16일 사회디자인연구소(소장 김대호) 주최 강연에서 한일관계 악화와 관련, ‘한일 간 공수(攻守)전환’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전(逆轉) 현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과 맥을 같이하는 말이다.
― 1980, 90년대에는 과거사 관련 논란이 터지면, 일본이 짐짓 물러서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적극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본이 더 이상 관대함을 베풀 수 있는 강대국이 아닌 거죠. 동북아(東北亞) 국제정치 지형에서 보면 중국에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양국 간 경제 규모의 차이는, 1990년에는 거의 10대 1이던 것이 30년 만에 3대 1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국내정치 지형의 변화도 있습니다. 지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정점(頂點)으로 하는 일본의 리더십은 과거 전통적 의미의 자민당(자유민주당) 보수(保守) 체질하고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 어떻게 다릅니까.
“조금 더 역사수정주의적 생각이 강한 사람들의 정권이라고 할까요. 아베 정권은 전후(戰後)체제를 완전히 탈각(脫殼)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집권한 세력이에요. ‘과거와 연관된 사죄·반성은 여기서 고리를 끊자,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어서 더욱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베는 ‘작은 트럼프’라는 비판 나와”
― 사실 기본적으로 보수 노선을 견지하고, 전전(戰前) 역사를 정당화하면서, 기회만 되면 맥아더헌법(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해온 것은 자민당의 일관된 흐름 아니었습니까.
“자민당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체로 3개의 큰 파벌이 있습니다.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전 총리로부터 이어지는 ‘게이세이카이(經世會)’,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전 총리에게 뿌리를 둔 ‘고치카이(宏池會)’, 그리고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전 총리에게 뿌리를 둔 ‘세이와카이(淸和會)’가 그것입니다. 아시아 외교에 대해 화해 지향적이던 게이세이카이는 한국·중국 문제에 대해 굉장히 소프트한 입장을 취했고, 고치카이는 리버럴한 성향이었습니다. 반면에 후쿠다파인 세이와카이는 매파였습니다. 문제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게이세이카이, 고치카이가 약화되면서 세이와카이 지배구조가 확립됐다는 데 있습니다. 아베는 세이와카이 내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자민당은 아베 1강(强)체제입니다.”
― 한일 간 갈등과 관련, 일본 내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일본의 언론·학계·정책서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편인데, 아베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소리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은 그동안 자유무역·공정무역을 국책(國策)으로 내세웠고, 얼마 전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도 앞장서서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일방주의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을 두고, 아베가 ‘작은 트럼프(small Trump)’가 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선생 등이 주도해서 낸 ‘한국은 적인가’라는 성명에는 5000명가량이 서명을 했다고 하잖아요. 아베 1강 구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 비판이 많이 무뎌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베 총리의 비열한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 지난 10여 년간 한일 양국도 과거 식민지배에 기인하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에서 벗어나 ‘보통국가’ 관계가 되어가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젊은이들까지도 반일(反日) 분위기에 휩쓸리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일관계는 과거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관계로 가는 과정에 있고, 실력이나 의식 면에서도 상당히 균등한 관계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는 그런 추세 속에서 돌발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과거에 반일하던 정서가 다시 표면화되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역사 인식, 진화해왔다”
―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1965년 체제가 문제 있었던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는 양국이 경제·안보적 협력을 하기 위해 맺은 것으로, 그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철저한 청산과 추궁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협정을 맺는다고 해도 그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 일본과의 관계에서 늘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과거사죠.
“관건은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 반성하느냐 하는 것이겠죠. 1965년 당시 일본은 식민지배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50여 년간, 특히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역사인식도 전향적(前向的)으로 진화해왔습니다.”
― 어떻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의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해 합법-부당까지는 왔습니다. 때문에 도의적 차원의 사과는 하지만, 그 불법성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식민지배가 불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국 간 입장 차이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우리로서는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국제법적으로도 식민지배 자체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법리(法理)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식민제도가 제도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법리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탈리아-리비아, 영국-케냐 간의 경우에서 보듯, 식민지배 상황에서 발생한 반인도적(反人道的) 행위에 대해 사과, 배상한 사례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징용 문제도 반인도적 상황에서 벌어진 강제노동이라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를 떠나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징용이라는 것은 전시(戰時)체제 아래서 국민들의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동원하는 것인데,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떠나서 징용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게 가능할까요.
“조선인들의 일본 기업에서 노동행위는 모집·알선 등의 단계를 거쳐서, 전쟁 마지막 8개월 동안 징용이 실시됐습니다. 이러한 행위 전체를 역사적 검증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고, 국제사법재판소(ICJ)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소송에 걸려 있는 케이스만 놓고 보면, ‘반인권적 상황에서 노동행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한국 밀쳐낼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 일본 내에서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징용공 판결 때문이 아니라, 안보상의 이유, 즉 전략물자의 대북(對北) 유출 같은 문제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 출연자나 《산케이》 같은 신문에서 그런 소리를 하기는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북전략물자 유출 때문이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안보상의 이유’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의 부적절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더군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가 이렇게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조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 원인은, 조금 멀리 보면 위안부 문제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 가까이로는 징용공 배상판결과 관련해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상황이 임박한 것 등을 꼽을 수 있겠지요.”
― 구조적 원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동북아 국제정치 지형이 변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국·중국·러시아 등 동북아 역내(域內) 국가들이 모두 자기들의 국익(國益)을 극대화하고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파워게임(power game)에 돌입했다고 봐야 합니다. ‘다른 모든 나라는 보편적 룰(rule)을 지키고 있는데 유독 일본만 돌변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나라가 됐다’는 식으로 진단해서는 올바른 해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 일본이 이번 기회에 미·일-중국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국을 한·미·일(韓·美·日) 3각동맹에서 밀어내려는 것은 아닐까요.
“최근에 나온 일본의 《외교청서》 《방위정책대강》 같은 문서들을 보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일본의 평가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일이 인도·태평양전략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한국을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밀쳐낼 정도로 일본이 그렇게 한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적대세력이나, 일본이 경계하는 중국의 세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본의 안보는 위태로워지거든요.”
― 냉전(冷戰)시대에 있었던 ‘한반도가 공산화되면 일본이 위험해진다’는 ‘부산적기론(釜山赤旗論)’이 생각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발상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낮춰 보는 것 같은 얘기들이 일본에서 나오는 것은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짝사랑하다 배신당한 심정’
이원덕 교수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일본에서 한국을 싫어한다는 사람들에게 ‘왜 한국을 싫어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한국인이 우리를 싫어하는데 우리가 왜 좋아하겠느냐, 짝사랑하다가 배신당한 심정이다’라고 하더군요. ‘한국이 사사건건 일본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일본이 그런 한국을 끝까지 끌어안고 가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 저도 아베 총리가 저러는 것은, 양국 관계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가치동맹(價値同盟)’으로 발전시켜보려 노력했지만 이명박(李明博)·박근혜(朴槿惠) 정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것, 그로서는 나름 어렵게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해주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엎어버린 데 대한 배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저도 아베 총리가 애초부터 반한적(反韓的)이었거나, ‘한국 없는 일본’ 전략을 추구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 한일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크게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결국 역사 문제에서 부딪힌 것이지요. 아베 총리는 일본 내에서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한국이 역사 문제에 대해 요구하는 것을 그는 터무니없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걸 꾹 참고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해주었는데, 그걸 엎어버리니 ‘앵거(anger・분노)지수’가 폭발한 것이죠.”
― ‘앵거지수’라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아베 총리의 행동은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일본 외무성 간부들조차 아베 총리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심리학적으로 보면, 엄청난 짝사랑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개헌=군사대국화 아니다”
― 지난 7월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총리는 개헌(改憲)을 향해 한 발자국 더 전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평화헌법개정=군사대국화(軍事大國化)=군국주의(軍國主義) 부활’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일본의 헌법개정을 보는 시각은 교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헌법개정=군국주의 부활 내지 군사대국화’는 절대 아닙니다. 평화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등에 대한 제약을 걷어내자, 다른 ‘보통국가’들에 비해 정당한 무력행사마저 부정된 면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자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병력, 군비지출, 군사지향 등에서 훨씬 덜 군사화된 나라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GDP(국내총생산) 1% 미만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메이저 파워(major power) 중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모두 2~3%를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 그래도 일본의 군사비 지출 증가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나오던데요.
“그건 일본의 군비지출이 늘어나는 데 대해 우리나라 미디어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너무 적게 늘어나서 들여다볼 가치가 없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근래 20년간 10% 가깝게 국방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다소 밸런스가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동북아 역학(力學)구도 속에서 일본의 군사력을 봐야 합니다.”
― 일본 사회가 우경화(右傾化)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일본 정계(政界)가 과거에 비해 우경화된 것은 맞습니다. 우경화 여부는 4가지 지표, 즉 ‘헌법개정’ ‘집단적 자위권’ ‘영토문제’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지표로 보면, 일본 정계가 1990년대보다 훨씬 후퇴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 시민사회 전체가 우경화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그럴까요.
“일부 한국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회의’ 같은 극우(極右)단체를 중심으로 일본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거의 소개가 되지 않고 있지만, 아베에 대한 자민당 내 불만세력도 꽤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료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對한반도 외교는 아베 專權사항”
― 왜 그렇습니까.
“아베 총리가 국장급 인사권까지 틀어쥐고 관료들을 완전히 억압하고 있거든요. 원래 일본 시스템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정(政)-관(官) 관계에서 관료가 독립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베 총리처럼 정이 관을 억압하는 건 일본 정치사에서 보면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 때문에 관료들 사이에서 불만이 누적되고 있어요.”
― 과거에 일본 정치인의 망언(妄言) 파동 등으로 한일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일본 관료들이 일정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관료 시스템이 정치에 의해 망가지고, 한국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외교부의 존재가 안 보이고…. 걱정입니다.
“외교적 합리성이 정치논리에 의해서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일본 외무성 국장은 일주일에 한 번 아베 총리에게 대면(對面)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관료들이 숨 쉴 공간이 있는 것이지만, 과거에 비하면 관에서 보고하는 대로 외교가 흘러가지는 않는 거죠. 특히 한반도 외교는 아베 총리의 전권(專權)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 아베 총리의 마음이 풀어져야 이 상황이 풀린다는 얘긴데, 하필이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성장환경이나 성격 등이 정반대입니다. 흔히 말하는 케미(chemi=chemistry)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데….
“인권변호사의 눈으로 보면 아베 총리가 한심해 보일 것이고, 정치명문가 출신인 아베 총리의 눈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아마추어로 보일 겁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외교”
― 지금 한일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양국 지도자들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더는 외교행위를 할 때, 적어도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국민을 선동하고 감정을 조장하는 것은 리더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는 외교에서 정상(頂上)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잖아요. 누가 대사(大使)로 나가느냐는 덜 중요해졌어요. 어느 나라나 대통령이나 총리가 모든 외교를 해버리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외교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리더는 굉장히 신중하고, 국익에 대한 계산에 철저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자신의 언행이 가져올 마지막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이나 참모에게 발언하도록 하고 대통령 본인은 매우 신중한 톤으로 반드시 필요할 때만 최소한의 언급에 그치는 것이 좋겠어요.”
― 지난 7월 말 일본을 방문했던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일본 측 인사와의 만남이 뜻대로 안 되자 ‘우리가 거지냐’며 발길을 돌렸더군요.
“과거에는 행정부 간에 충돌이 있어도 의회 라인에 한국은 김종필(金鍾泌)・박태준(朴泰俊), 일본에서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같은 원로(元老)들이 있어서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모두 정경(政經) 엘리트 간 네트워크에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한국에서는 민주화운동 세대가, 일본에서는 국가주의적 성향의 정치인들이 주류가 되면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가 어려워질수록 의원외교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쪽마저 막히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청구권 검토 문서
다시 한일관계 악화의 단초가 된 징용공 문제로 화제를 돌렸다.
― 징용공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고, 국내에서도 이미 1970년대와 2000년대에 보상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민관(民官)공동위원회가 청구권 문제를 검토한 문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서는 정책론과 법리해석이 혼재(混在)해 있는 문서라고 봅니다.”
― 그렇습니까.
“법리해석으로 보면 조국(曺國) 전 민정수석비서관(법무부 장관 지명자)처럼 말할 수 있어요. 민관공동위원회는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실 법리적으로는 일본 최고재판소, 심지어 일본 외무성도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멸됐다고 할 리가 있나요.”
― 정말 일본 최고재판소와 외무성도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건 아니라고 했습니까.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니시마쓰 판결에서 ‘피해자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나,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訴)를 청구할 권능(權能)은 없다’고 판시(判示)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야나이 조약국장의 1991년 발언, 2018년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장관의 발언을 보면, ‘청구권협정에 의해 외교적 보호권은 소멸됐으나 원(原)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권리는 행사될 수 없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 2005년 민관위원회의 입장은 결국 무엇입니까.
“민관위원회 문서를 보면, 징용피해자의 청구권 요구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정부의 외교보호권은 소멸됐으나 개인청구권 그 자체는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기술(記述)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정책론의 관점에서, 사할린 억류교포, 원폭(原爆)피해자, 위안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계속 법적 추궁을 하겠지만, 징용을 포함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1965년에 청구권협정에 의해 정리가 된 것으로 간주했어요. 이런 결론에 따라서 2007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징용피해자에게 68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 그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저도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어요. 정부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만 했지, 식민지 불법상황에서 벌어진 모든 개인의 청구권을 전면적으로 일본 정부에 청구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국 전 수석처럼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특히 정부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독일의 경우
―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본심은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명분론 뒤에 숨어서 일본의 법적 책임을 계속 추궁하려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건 일본과의 전면적 역사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 지금 벌써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수위(水位)에 있어서, 전면적 배상을 요구하겠다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것도 시간문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이기는 게임은 아니라고 봐요.”
― 그렇죠.
“저는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건에 한정해서 사법적 결론을 내리고 거기서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거기서 무한대로 가져가면 그야말로 역사전쟁이 되는 거지요.”
―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약 21만명의 징병·징용 피해자가 존재한다던데, 그 사람들이 다 배상을 요구하고 나서면 어떻게 합니까.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970만명의 폴란드인을 강제노동에 동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슈뢰더 정부는 2000년 강제노동 관련 기업과 독일 정부가 각각 50%씩 출연해 기억책임미래기금을 조성하고, 생존자 150만명에게 1인당 1만5000마르크(한화 약 1100만원)의 지원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절도 있게 한도를 정한 것은 독일적인 지혜입니다. 우리도 징용・징병 피해자를 21만명, 많게는 100만명까지 보지만, 생존자만 보면 4500~5000명입니다.”
― 폴란드인들도 과거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정을 품고 있지만, 수백만명의 폴란드인이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히 자제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완전한 수준까지 추궁한다는 건 외교로서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도를 정해야지요.”
― 당연한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작심하고 한일관계를 파탄 내려고 저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만일 한・미・일 관계를 깨고, 한국이 북・중・러 쪽으로 바꿔 타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어드바이스를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겠지요. 저는 이 정부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韓日 간 休戰에 도움”
― 이미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出捐)에 의한 피해자 구제기금 설치, 중재(仲裁)위원회 회부 등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강연 때 국제사법재판소(ICJ)로 징용공 문제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해법이라고 했는데, 아직 그렇게 할 여지가 있을까요.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가서 일본이 더 강도 높게 보복을 하면, 국제사법재판소 공동제소(共同提訴)에 의한 해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가 그걸 받으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도 있겠죠. 다만 국내 컨센서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제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경우의 장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3~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일 간 갈등은 일종의 휴전(休戰)상태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강대강(强對强)의 대결구도를 차분하고 냉정한 법리 논쟁의 구도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양국이 합의하면 한국에서의 강제집행을 보류할 수 있고, 그러면 일본도 경제보복 조치를 사실상 철회하는 수순을 밟게 되겠지요. 한일 양국 최고법원 판결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3의 국제사법기관의 판결로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은 평화적 분쟁 해결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 많은 국민은 ‘일본의 국제적 위상 등으로 볼 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관은 아시아 3명, 아프리카 3명, 중남미 3명, 동유럽 2명, 미국·서유럽 4명, 그리고 한국 정부가 지명하는 재판관 1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됩니다. 과거 식민지배의 주체였던 미국·서유럽 출신은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 인적 구성은 그렇다 해도, 법리적으로는 어떨까요.
“국제법이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인도적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강제노동 피해자의 권리가 국가 간 합의에 의해 완전히 소멸될 수 없다’는 법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강제노역으로 인정받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배상액수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조해보면, 우리 대법원 판결에 비해 상당히 감액(減額)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패소할 경우의 후폭풍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지만, 한국이 승소하면 일본 기업이 배상을 지불하게 되고, 패소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피해자의 구제를 대행해주면 됩니다.”
以德報怨
― 징용공 문제가 전례(前例)가 되어 일본이 독도 문제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주장할까 봐 걱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이 공동제소하지 않는 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여기서 이원덕 교수는 조심스럽게 “사실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보다 더 좋은 대안(代案)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통령 특별성명으로 일방적으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배상포기, 피해자 국내 구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다음 3개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일제 식민지배는 불법적인 강점(强占)이었으며, 일본은 이에 대해 사죄 반성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대일 배상・보상 등 일체의 물질적 요구는 영원히 포기한다.
셋째, 모든 식민지배와 연관된 피해자 구제 문제는 한국 정부의 책임 아래 수행한다.
중국은 과거 일제 패망 후 ‘이덕보원(以德報怨)’이라고 하면서 물질적 배상 요구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 화끈하고 우리 국민의 정서에도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방안이 낫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행이 낫습니까?”
― 당연히 이 방안이 낫지요. 저도 늘 비슷한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게 국제사회에 대해서나 일본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가장 떳떳한 방안이죠.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선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문 대통령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변호사, 하나는 폴리티션(politician・선거만을 의식하는 정치인), 하나는 스테이츠먼(statesman・국가 장래를 진정으로 고민하는 정치가)…. 안타까운 건 문재인 대통령은 좀처럼 변호사 수준의 사고(思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게 정치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하는 폴리티션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문 대통령이 스테이츠먼, 리더로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지….”
“美, 구체적 중재 않을 것”
― 아마 어려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선언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원덕 교수의 얼굴에는 상심한 듯한 표정이 스쳐갔다.
“그래요? 굉장히 자해적(自害的)인 조치인데…. 일본이 지소미아에서 엄청난 이익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구조라면 좋은 보복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미국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할 카드고, 일본의 보복에 대한 대항카드가 못 되는 건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처럼 목표가 아예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걸 그렇게 활용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겠지요.
“지소미아 파기 주장은 미국에 중재를 요구하는 압력으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파기하고 나면 카드로서의 효과가 없어지고 맙니다.
미국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견주고 있는데, 그건 미일동맹으로 운동장을 기울게 하는 겁니다. 미국을 이 기회에 떼어내고자 하는 거라면 좋은 수가 될지도 모르겠지요. 왜 그게 카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판 깨지는 걸 두려워하는 미국에 어필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 얼마 전 미국이 한일 간 중재를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미국이 진지하게 중재에 나서려고 할까요.
“한일이 다투는 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원론적 차원에서 양국 간 갈등을 이완시키려고 노력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구체적인 안(案)을 가지고 중재를 하려 들지는 않을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自國)중심주의 노선을 걸으면서, 통상을 무기로 활용하고 있잖습니까. 오바마 시절의 미국이었다면 몰라도….”
“일본 사회, 한일 갈등에 관심 없어”
― 이러다가 정말로 한일관계가 전면적으로 파탄 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일본 없는 한국’, 일본은 ‘한국 없는 일본’을 꾸려가야 하는데, 그야말로 양쪽 모두에게 자해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크게 보면 미중 양강(兩强) 구도 속에 한국과 일본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양국이 협력을 통해 펼쳐나갈 공간이 얼마나 큽니까. 큰 전략적 그림 속에서 대일 외교를 해야 하는데, 그런 큰 그림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면 안 된다’는 환상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 아직까지 국민들 차원에서는 복구의 여지가 있지만, 국민 감정을 선동하는 정치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다가 불상사라도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관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더 그러니…. 일본(정부)도 마찬가지여서 너무 우리에게만 책임을 추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 지난 한 달 동안 일본에 머물다 왔다고 들었는데,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국과 비교하면 비대칭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있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는 거의 국난(國難) 상황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일본이 ‘어떤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권력 핵심부는 몰라도 일본 사회 일반은 ‘무덤덤하고 관심 없다’는 게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그걸 고려하는 대일전략이 필요합니다.”
―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말하면 일본 국민까지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내 오피니언 리더나 미디어가 모두 아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고들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의 전략적 공간이 되겠지요.”
―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이 자신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 경제에 대해 공격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특수한 국익을 주장하면서 맞부닥칠 게 아니라, 보편적 가치와 룰을 준거점(準據點)으로 해서 대응해야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사회나 일본을 향해 자유무역・공정무역을 요구해야지, 일본이 보복하니 우리도 보복으로 맞선다는 식의 대응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 사실 화이트 리스트 배제 같은 건, 일본이 한일관계 좋던 시절에 호의에서 우리에게 주었던 특혜를 거두어들인 것이지, 보복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보복과 정책 변경의 그레이 존에 있다고 할까요.”
“日이 아직 칼을 휘두르는 단계는 아니다”
― 우리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큰 문제는 아니다. 오해가 있어 그런 모양인데 대화를 통해 잘 풀어나가겠다’고 했으면 상황은 더 나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경제침탈이라고 비난하고, 국채보상운동·물산장려운동·금(金)모으기운동을 소환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치에서 어느 상황에 전쟁이 터지는지 아세요?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읽었을 때 전쟁이 나더라고요, 제1차 세계대전도 ‘사라예보 사건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문제였잖아요. 저도 상황을 과잉으로 읽는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대만은 화이트 리스트 국가가 아니면서도 일본과 자유롭게 교역하는 데 아무런 문제도 못 느끼고 있잖아요.”
― 일본이 수출관리절차 등을 이유로 까다롭게 굴면서 골탕을 먹이지 않겠느냐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 무역관리 당국이 재량권(裁量權)이라는 칼을 휘두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건데, 분명히 말해서 아직 일본이 칼을 휘두르는 단계는 아닙니다. 칼자루를 쥐었을 뿐인 거죠.”
― 일본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하는 분위기가 냉랭해졌다든지 하는 건 못 느꼈습니까.
“전혀 못 느꼈습니다. 아까 말한 관심의 비대칭인데, 최근 며칠 사이에 상황이 더 나빠지긴 했지만, 미디어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 같은 게 해외토픽처럼 소개되기는 했지만…. 지금의 한일 갈등은 일본 국민들에게 중심적 어젠다(agenda)가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양국 관계가 불편하다는 게 일본에서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한일 간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듣기 위해 이원덕(李元德・57)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를 만났다. 이 교수는 한일관계에 대해 가장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로 꼽힌다.
‘韓日 간 攻守전환’
 |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反日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그동안 양국 간의 싸움은 대체로 비대칭(非對稱)이었습니다. 한국이 과열양상을 보이더라도 일본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지난 50년 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실상의 경제보복-‘아베의 경제보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은 무척 이례적(異例的)인 일입니다. 2010년 중일(中日) 간 센가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 당시 중국이 희토류(希土類)를 무기화(武器化)한 것을 제외하면, 동아시아에서는 정경분리(政經分離)에 대한 규범이 어느 정도 살아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이 무역보복이라는 칼을 뽑은 것은 일본 외교사에서도 ‘역사적’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원덕 교수가 지난 7월 16일 사회디자인연구소(소장 김대호) 주최 강연에서 한일관계 악화와 관련, ‘한일 간 공수(攻守)전환’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전(逆轉) 현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과 맥을 같이하는 말이다.
― 1980, 90년대에는 과거사 관련 논란이 터지면, 일본이 짐짓 물러서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적극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본이 더 이상 관대함을 베풀 수 있는 강대국이 아닌 거죠. 동북아(東北亞) 국제정치 지형에서 보면 중국에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양국 간 경제 규모의 차이는, 1990년에는 거의 10대 1이던 것이 30년 만에 3대 1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국내정치 지형의 변화도 있습니다. 지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정점(頂點)으로 하는 일본의 리더십은 과거 전통적 의미의 자민당(자유민주당) 보수(保守) 체질하고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 어떻게 다릅니까.
“조금 더 역사수정주의적 생각이 강한 사람들의 정권이라고 할까요. 아베 정권은 전후(戰後)체제를 완전히 탈각(脫殼)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집권한 세력이에요. ‘과거와 연관된 사죄·반성은 여기서 고리를 끊자,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어서 더욱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베는 ‘작은 트럼프’라는 비판 나와”
― 사실 기본적으로 보수 노선을 견지하고, 전전(戰前) 역사를 정당화하면서, 기회만 되면 맥아더헌법(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해온 것은 자민당의 일관된 흐름 아니었습니까.
“자민당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체로 3개의 큰 파벌이 있습니다.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전 총리로부터 이어지는 ‘게이세이카이(經世會)’,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전 총리에게 뿌리를 둔 ‘고치카이(宏池會)’, 그리고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전 총리에게 뿌리를 둔 ‘세이와카이(淸和會)’가 그것입니다. 아시아 외교에 대해 화해 지향적이던 게이세이카이는 한국·중국 문제에 대해 굉장히 소프트한 입장을 취했고, 고치카이는 리버럴한 성향이었습니다. 반면에 후쿠다파인 세이와카이는 매파였습니다. 문제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게이세이카이, 고치카이가 약화되면서 세이와카이 지배구조가 확립됐다는 데 있습니다. 아베는 세이와카이 내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자민당은 아베 1강(强)체제입니다.”
― 한일 간 갈등과 관련, 일본 내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일본의 언론·학계·정책서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편인데, 아베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소리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은 그동안 자유무역·공정무역을 국책(國策)으로 내세웠고, 얼마 전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도 앞장서서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일방주의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을 두고, 아베가 ‘작은 트럼프(small Trump)’가 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선생 등이 주도해서 낸 ‘한국은 적인가’라는 성명에는 5000명가량이 서명을 했다고 하잖아요. 아베 1강 구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 비판이 많이 무뎌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베 총리의 비열한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 지난 10여 년간 한일 양국도 과거 식민지배에 기인하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에서 벗어나 ‘보통국가’ 관계가 되어가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젊은이들까지도 반일(反日) 분위기에 휩쓸리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일관계는 과거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관계로 가는 과정에 있고, 실력이나 의식 면에서도 상당히 균등한 관계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는 그런 추세 속에서 돌발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과거에 반일하던 정서가 다시 표면화되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역사 인식, 진화해왔다”
―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1965년 체제가 문제 있었던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는 양국이 경제·안보적 협력을 하기 위해 맺은 것으로, 그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철저한 청산과 추궁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협정을 맺는다고 해도 그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 일본과의 관계에서 늘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과거사죠.
“관건은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 반성하느냐 하는 것이겠죠. 1965년 당시 일본은 식민지배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50여 년간, 특히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역사인식도 전향적(前向的)으로 진화해왔습니다.”
― 어떻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의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해 합법-부당까지는 왔습니다. 때문에 도의적 차원의 사과는 하지만, 그 불법성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식민지배가 불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국 간 입장 차이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우리로서는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국제법적으로도 식민지배 자체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법리(法理)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식민제도가 제도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법리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탈리아-리비아, 영국-케냐 간의 경우에서 보듯, 식민지배 상황에서 발생한 반인도적(反人道的) 행위에 대해 사과, 배상한 사례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징용 문제도 반인도적 상황에서 벌어진 강제노동이라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를 떠나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징용이라는 것은 전시(戰時)체제 아래서 국민들의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동원하는 것인데,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떠나서 징용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게 가능할까요.
“조선인들의 일본 기업에서 노동행위는 모집·알선 등의 단계를 거쳐서, 전쟁 마지막 8개월 동안 징용이 실시됐습니다. 이러한 행위 전체를 역사적 검증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고, 국제사법재판소(ICJ)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소송에 걸려 있는 케이스만 놓고 보면, ‘반인권적 상황에서 노동행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한국 밀쳐낼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 일본 내에서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징용공 판결 때문이 아니라, 안보상의 이유, 즉 전략물자의 대북(對北) 유출 같은 문제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 출연자나 《산케이》 같은 신문에서 그런 소리를 하기는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북전략물자 유출 때문이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안보상의 이유’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의 부적절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더군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가 이렇게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조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 원인은, 조금 멀리 보면 위안부 문제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 가까이로는 징용공 배상판결과 관련해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상황이 임박한 것 등을 꼽을 수 있겠지요.”
― 구조적 원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동북아 국제정치 지형이 변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국·중국·러시아 등 동북아 역내(域內) 국가들이 모두 자기들의 국익(國益)을 극대화하고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파워게임(power game)에 돌입했다고 봐야 합니다. ‘다른 모든 나라는 보편적 룰(rule)을 지키고 있는데 유독 일본만 돌변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나라가 됐다’는 식으로 진단해서는 올바른 해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 일본이 이번 기회에 미·일-중국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국을 한·미·일(韓·美·日) 3각동맹에서 밀어내려는 것은 아닐까요.
“최근에 나온 일본의 《외교청서》 《방위정책대강》 같은 문서들을 보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일본의 평가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일이 인도·태평양전략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한국을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밀쳐낼 정도로 일본이 그렇게 한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적대세력이나, 일본이 경계하는 중국의 세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본의 안보는 위태로워지거든요.”
― 냉전(冷戰)시대에 있었던 ‘한반도가 공산화되면 일본이 위험해진다’는 ‘부산적기론(釜山赤旗論)’이 생각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발상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낮춰 보는 것 같은 얘기들이 일본에서 나오는 것은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짝사랑하다 배신당한 심정’
 |
| 2015년 11월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고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
“일본에서 한국을 싫어한다는 사람들에게 ‘왜 한국을 싫어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한국인이 우리를 싫어하는데 우리가 왜 좋아하겠느냐, 짝사랑하다가 배신당한 심정이다’라고 하더군요. ‘한국이 사사건건 일본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일본이 그런 한국을 끝까지 끌어안고 가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 저도 아베 총리가 저러는 것은, 양국 관계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가치동맹(價値同盟)’으로 발전시켜보려 노력했지만 이명박(李明博)·박근혜(朴槿惠) 정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것, 그로서는 나름 어렵게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해주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엎어버린 데 대한 배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저도 아베 총리가 애초부터 반한적(反韓的)이었거나, ‘한국 없는 일본’ 전략을 추구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 한일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크게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결국 역사 문제에서 부딪힌 것이지요. 아베 총리는 일본 내에서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한국이 역사 문제에 대해 요구하는 것을 그는 터무니없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걸 꾹 참고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해주었는데, 그걸 엎어버리니 ‘앵거(anger・분노)지수’가 폭발한 것이죠.”
― ‘앵거지수’라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아베 총리의 행동은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일본 외무성 간부들조차 아베 총리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심리학적으로 보면, 엄청난 짝사랑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개헌=군사대국화 아니다”
― 지난 7월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총리는 개헌(改憲)을 향해 한 발자국 더 전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평화헌법개정=군사대국화(軍事大國化)=군국주의(軍國主義) 부활’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일본의 헌법개정을 보는 시각은 교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헌법개정=군국주의 부활 내지 군사대국화’는 절대 아닙니다. 평화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등에 대한 제약을 걷어내자, 다른 ‘보통국가’들에 비해 정당한 무력행사마저 부정된 면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자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병력, 군비지출, 군사지향 등에서 훨씬 덜 군사화된 나라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GDP(국내총생산) 1% 미만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메이저 파워(major power) 중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모두 2~3%를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 그래도 일본의 군사비 지출 증가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나오던데요.
“그건 일본의 군비지출이 늘어나는 데 대해 우리나라 미디어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너무 적게 늘어나서 들여다볼 가치가 없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근래 20년간 10% 가깝게 국방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다소 밸런스가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동북아 역학(力學)구도 속에서 일본의 군사력을 봐야 합니다.”
― 일본 사회가 우경화(右傾化)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일본 정계(政界)가 과거에 비해 우경화된 것은 맞습니다. 우경화 여부는 4가지 지표, 즉 ‘헌법개정’ ‘집단적 자위권’ ‘영토문제’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지표로 보면, 일본 정계가 1990년대보다 훨씬 후퇴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 시민사회 전체가 우경화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그럴까요.
“일부 한국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회의’ 같은 극우(極右)단체를 중심으로 일본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거의 소개가 되지 않고 있지만, 아베에 대한 자민당 내 불만세력도 꽤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료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對한반도 외교는 아베 專權사항”
― 왜 그렇습니까.
“아베 총리가 국장급 인사권까지 틀어쥐고 관료들을 완전히 억압하고 있거든요. 원래 일본 시스템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정(政)-관(官) 관계에서 관료가 독립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베 총리처럼 정이 관을 억압하는 건 일본 정치사에서 보면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 때문에 관료들 사이에서 불만이 누적되고 있어요.”
― 과거에 일본 정치인의 망언(妄言) 파동 등으로 한일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일본 관료들이 일정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관료 시스템이 정치에 의해 망가지고, 한국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외교부의 존재가 안 보이고…. 걱정입니다.
“외교적 합리성이 정치논리에 의해서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일본 외무성 국장은 일주일에 한 번 아베 총리에게 대면(對面)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관료들이 숨 쉴 공간이 있는 것이지만, 과거에 비하면 관에서 보고하는 대로 외교가 흘러가지는 않는 거죠. 특히 한반도 외교는 아베 총리의 전권(專權)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 아베 총리의 마음이 풀어져야 이 상황이 풀린다는 얘긴데, 하필이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성장환경이나 성격 등이 정반대입니다. 흔히 말하는 케미(chemi=chemistry)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데….
“인권변호사의 눈으로 보면 아베 총리가 한심해 보일 것이고, 정치명문가 출신인 아베 총리의 눈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아마추어로 보일 겁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외교”
 |
| 지난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냉랭한 악수를 나누었다. 사진=뉴시스 |
“리더는 외교행위를 할 때, 적어도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국민을 선동하고 감정을 조장하는 것은 리더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는 외교에서 정상(頂上)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잖아요. 누가 대사(大使)로 나가느냐는 덜 중요해졌어요. 어느 나라나 대통령이나 총리가 모든 외교를 해버리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외교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리더는 굉장히 신중하고, 국익에 대한 계산에 철저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자신의 언행이 가져올 마지막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이나 참모에게 발언하도록 하고 대통령 본인은 매우 신중한 톤으로 반드시 필요할 때만 최소한의 언급에 그치는 것이 좋겠어요.”
― 지난 7월 말 일본을 방문했던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일본 측 인사와의 만남이 뜻대로 안 되자 ‘우리가 거지냐’며 발길을 돌렸더군요.
“과거에는 행정부 간에 충돌이 있어도 의회 라인에 한국은 김종필(金鍾泌)・박태준(朴泰俊), 일본에서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같은 원로(元老)들이 있어서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모두 정경(政經) 엘리트 간 네트워크에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한국에서는 민주화운동 세대가, 일본에서는 국가주의적 성향의 정치인들이 주류가 되면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가 어려워질수록 의원외교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쪽마저 막히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청구권 검토 문서
 |
| 2018년 10월 30일 신일철주금 징용공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한일관계 악화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가 됐다. 사진=조선DB |
― 징용공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고, 국내에서도 이미 1970년대와 2000년대에 보상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민관(民官)공동위원회가 청구권 문제를 검토한 문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서는 정책론과 법리해석이 혼재(混在)해 있는 문서라고 봅니다.”
― 그렇습니까.
“법리해석으로 보면 조국(曺國) 전 민정수석비서관(법무부 장관 지명자)처럼 말할 수 있어요. 민관공동위원회는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실 법리적으로는 일본 최고재판소, 심지어 일본 외무성도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멸됐다고 할 리가 있나요.”
― 정말 일본 최고재판소와 외무성도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건 아니라고 했습니까.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니시마쓰 판결에서 ‘피해자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나,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訴)를 청구할 권능(權能)은 없다’고 판시(判示)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야나이 조약국장의 1991년 발언, 2018년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장관의 발언을 보면, ‘청구권협정에 의해 외교적 보호권은 소멸됐으나 원(原)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권리는 행사될 수 없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 2005년 민관위원회의 입장은 결국 무엇입니까.
“민관위원회 문서를 보면, 징용피해자의 청구권 요구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정부의 외교보호권은 소멸됐으나 개인청구권 그 자체는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기술(記述)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정책론의 관점에서, 사할린 억류교포, 원폭(原爆)피해자, 위안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계속 법적 추궁을 하겠지만, 징용을 포함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1965년에 청구권협정에 의해 정리가 된 것으로 간주했어요. 이런 결론에 따라서 2007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징용피해자에게 68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 그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저도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어요. 정부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만 했지, 식민지 불법상황에서 벌어진 모든 개인의 청구권을 전면적으로 일본 정부에 청구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국 전 수석처럼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특히 정부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독일의 경우
―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본심은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명분론 뒤에 숨어서 일본의 법적 책임을 계속 추궁하려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건 일본과의 전면적 역사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 지금 벌써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수위(水位)에 있어서, 전면적 배상을 요구하겠다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것도 시간문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이기는 게임은 아니라고 봐요.”
― 그렇죠.
“저는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건에 한정해서 사법적 결론을 내리고 거기서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거기서 무한대로 가져가면 그야말로 역사전쟁이 되는 거지요.”
―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약 21만명의 징병·징용 피해자가 존재한다던데, 그 사람들이 다 배상을 요구하고 나서면 어떻게 합니까.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970만명의 폴란드인을 강제노동에 동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슈뢰더 정부는 2000년 강제노동 관련 기업과 독일 정부가 각각 50%씩 출연해 기억책임미래기금을 조성하고, 생존자 150만명에게 1인당 1만5000마르크(한화 약 1100만원)의 지원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절도 있게 한도를 정한 것은 독일적인 지혜입니다. 우리도 징용・징병 피해자를 21만명, 많게는 100만명까지 보지만, 생존자만 보면 4500~5000명입니다.”
― 폴란드인들도 과거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정을 품고 있지만, 수백만명의 폴란드인이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히 자제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완전한 수준까지 추궁한다는 건 외교로서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도를 정해야지요.”
― 당연한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작심하고 한일관계를 파탄 내려고 저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만일 한・미・일 관계를 깨고, 한국이 북・중・러 쪽으로 바꿔 타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어드바이스를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겠지요. 저는 이 정부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韓日 간 休戰에 도움”
― 이미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出捐)에 의한 피해자 구제기금 설치, 중재(仲裁)위원회 회부 등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강연 때 국제사법재판소(ICJ)로 징용공 문제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해법이라고 했는데, 아직 그렇게 할 여지가 있을까요.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가서 일본이 더 강도 높게 보복을 하면, 국제사법재판소 공동제소(共同提訴)에 의한 해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가 그걸 받으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도 있겠죠. 다만 국내 컨센서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제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경우의 장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3~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일 간 갈등은 일종의 휴전(休戰)상태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강대강(强對强)의 대결구도를 차분하고 냉정한 법리 논쟁의 구도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양국이 합의하면 한국에서의 강제집행을 보류할 수 있고, 그러면 일본도 경제보복 조치를 사실상 철회하는 수순을 밟게 되겠지요. 한일 양국 최고법원 판결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3의 국제사법기관의 판결로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은 평화적 분쟁 해결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 많은 국민은 ‘일본의 국제적 위상 등으로 볼 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관은 아시아 3명, 아프리카 3명, 중남미 3명, 동유럽 2명, 미국·서유럽 4명, 그리고 한국 정부가 지명하는 재판관 1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됩니다. 과거 식민지배의 주체였던 미국·서유럽 출신은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 인적 구성은 그렇다 해도, 법리적으로는 어떨까요.
“국제법이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인도적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강제노동 피해자의 권리가 국가 간 합의에 의해 완전히 소멸될 수 없다’는 법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강제노역으로 인정받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배상액수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조해보면, 우리 대법원 판결에 비해 상당히 감액(減額)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패소할 경우의 후폭풍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지만, 한국이 승소하면 일본 기업이 배상을 지불하게 되고, 패소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피해자의 구제를 대행해주면 됩니다.”
以德報怨
― 징용공 문제가 전례(前例)가 되어 일본이 독도 문제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주장할까 봐 걱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이 공동제소하지 않는 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여기서 이원덕 교수는 조심스럽게 “사실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보다 더 좋은 대안(代案)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통령 특별성명으로 일방적으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배상포기, 피해자 국내 구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다음 3개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일제 식민지배는 불법적인 강점(强占)이었으며, 일본은 이에 대해 사죄 반성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대일 배상・보상 등 일체의 물질적 요구는 영원히 포기한다.
셋째, 모든 식민지배와 연관된 피해자 구제 문제는 한국 정부의 책임 아래 수행한다.
중국은 과거 일제 패망 후 ‘이덕보원(以德報怨)’이라고 하면서 물질적 배상 요구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 화끈하고 우리 국민의 정서에도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방안이 낫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행이 낫습니까?”
― 당연히 이 방안이 낫지요. 저도 늘 비슷한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게 국제사회에 대해서나 일본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가장 떳떳한 방안이죠.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선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문 대통령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변호사, 하나는 폴리티션(politician・선거만을 의식하는 정치인), 하나는 스테이츠먼(statesman・국가 장래를 진정으로 고민하는 정치가)…. 안타까운 건 문재인 대통령은 좀처럼 변호사 수준의 사고(思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게 정치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하는 폴리티션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문 대통령이 스테이츠먼, 리더로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지….”
“美, 구체적 중재 않을 것”
 |
| 지난 8월 7일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駐韓일본대사관 앞에서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원덕 교수의 얼굴에는 상심한 듯한 표정이 스쳐갔다.
“그래요? 굉장히 자해적(自害的)인 조치인데…. 일본이 지소미아에서 엄청난 이익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구조라면 좋은 보복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미국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할 카드고, 일본의 보복에 대한 대항카드가 못 되는 건데….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처럼 목표가 아예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걸 그렇게 활용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겠지요.
“지소미아 파기 주장은 미국에 중재를 요구하는 압력으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파기하고 나면 카드로서의 효과가 없어지고 맙니다.
미국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견주고 있는데, 그건 미일동맹으로 운동장을 기울게 하는 겁니다. 미국을 이 기회에 떼어내고자 하는 거라면 좋은 수가 될지도 모르겠지요. 왜 그게 카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판 깨지는 걸 두려워하는 미국에 어필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 얼마 전 미국이 한일 간 중재를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미국이 진지하게 중재에 나서려고 할까요.
“한일이 다투는 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원론적 차원에서 양국 간 갈등을 이완시키려고 노력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구체적인 안(案)을 가지고 중재를 하려 들지는 않을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自國)중심주의 노선을 걸으면서, 통상을 무기로 활용하고 있잖습니까. 오바마 시절의 미국이었다면 몰라도….”
“일본 사회, 한일 갈등에 관심 없어”
― 이러다가 정말로 한일관계가 전면적으로 파탄 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일본 없는 한국’, 일본은 ‘한국 없는 일본’을 꾸려가야 하는데, 그야말로 양쪽 모두에게 자해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크게 보면 미중 양강(兩强) 구도 속에 한국과 일본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양국이 협력을 통해 펼쳐나갈 공간이 얼마나 큽니까. 큰 전략적 그림 속에서 대일 외교를 해야 하는데, 그런 큰 그림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면 안 된다’는 환상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 아직까지 국민들 차원에서는 복구의 여지가 있지만, 국민 감정을 선동하는 정치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다가 불상사라도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관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더 그러니…. 일본(정부)도 마찬가지여서 너무 우리에게만 책임을 추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 지난 한 달 동안 일본에 머물다 왔다고 들었는데,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국과 비교하면 비대칭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있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는 거의 국난(國難) 상황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일본이 ‘어떤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권력 핵심부는 몰라도 일본 사회 일반은 ‘무덤덤하고 관심 없다’는 게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그걸 고려하는 대일전략이 필요합니다.”
―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말하면 일본 국민까지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내 오피니언 리더나 미디어가 모두 아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고들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의 전략적 공간이 되겠지요.”
―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이 자신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 경제에 대해 공격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특수한 국익을 주장하면서 맞부닥칠 게 아니라, 보편적 가치와 룰을 준거점(準據點)으로 해서 대응해야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사회나 일본을 향해 자유무역・공정무역을 요구해야지, 일본이 보복하니 우리도 보복으로 맞선다는 식의 대응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 사실 화이트 리스트 배제 같은 건, 일본이 한일관계 좋던 시절에 호의에서 우리에게 주었던 특혜를 거두어들인 것이지, 보복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보복과 정책 변경의 그레이 존에 있다고 할까요.”
“日이 아직 칼을 휘두르는 단계는 아니다”
― 우리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큰 문제는 아니다. 오해가 있어 그런 모양인데 대화를 통해 잘 풀어나가겠다’고 했으면 상황은 더 나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경제침탈이라고 비난하고, 국채보상운동·물산장려운동·금(金)모으기운동을 소환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치에서 어느 상황에 전쟁이 터지는지 아세요?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읽었을 때 전쟁이 나더라고요, 제1차 세계대전도 ‘사라예보 사건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문제였잖아요. 저도 상황을 과잉으로 읽는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대만은 화이트 리스트 국가가 아니면서도 일본과 자유롭게 교역하는 데 아무런 문제도 못 느끼고 있잖아요.”
― 일본이 수출관리절차 등을 이유로 까다롭게 굴면서 골탕을 먹이지 않겠느냐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 무역관리 당국이 재량권(裁量權)이라는 칼을 휘두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건데, 분명히 말해서 아직 일본이 칼을 휘두르는 단계는 아닙니다. 칼자루를 쥐었을 뿐인 거죠.”
― 일본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하는 분위기가 냉랭해졌다든지 하는 건 못 느꼈습니까.
“전혀 못 느꼈습니다. 아까 말한 관심의 비대칭인데, 최근 며칠 사이에 상황이 더 나빠지긴 했지만, 미디어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 같은 게 해외토픽처럼 소개되기는 했지만…. 지금의 한일 갈등은 일본 국민들에게 중심적 어젠다(agenda)가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양국 관계가 불편하다는 게 일본에서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