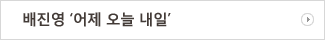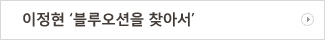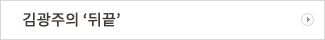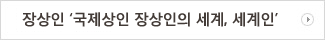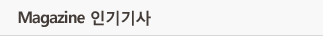.jpg)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조선DB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구사하는 언어(신랄한 비판)는 선명하고 깔끔하다.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지지층 결집엔 효과적이다.
하지만 당 내부를 바라보는 황교안 대표의 시각에는 모순이 서려 있다. 30일 한국당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황 대표는 “친박에 빚진 것 없다” “친박 키우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내 계파 갈등을 불식시키려는 황 대표의 고심(苦心)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하나하나 곱씹어보면, 뒷맛은 그리 개운치 않다.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보면 ‘황교안과 친박’은 마치 각자도생하는 관계처럼 보인다. 정치공학 상 양측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황 대표 체제의 뿌리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측면에서 따져보면, 양측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존공생 관계’ 아닐까?
그런 점에서 “친박에 빚진 것 없다”는 황 대표의 말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난 2월 대표 경선에서 그가 친박의 후원을 등에 업고 당선됐다는 건 정치권의 정설(定說)로 굳어진 지 오래다.
황 대표는 한국당 대표 경선 당시, 국민여론조사에서 2위를 한 오세훈 후보에게 12.5%p 차로 졌다. 당내 선거인단 조사에서만 오세훈, 김진태(3위) 후보를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눌렀을 뿐이다. 이는 당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박계가 황 대표에게 '지원사격' 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친박에 빚진 것 없다”는 말은 누군가 황교안 체제의 정통성을 물고 늘어질 경우, 독배(毒杯)가 될 가능성이 있다.
“친박 키우러 온 것 아니다”라는 말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황 대표 본인은 그리 생각하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양새가 됐다. 당 사무총장에 ‘친박 핵심’ 한선교, 박맹우 의원을 연이어 임명한 게 이를 방증한다. 사무총장만이 아니다. 대변인(민경욱 의원), 전략기획부총장(추경호 의원), 사법개혁특위위원장(유기준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김재원 의원) 등 핵심 요직이 모두 친박 일색(一色)이다.
기자는 지난 3월 3일 황교안 대표가 당선된 직후, 황 대표 측이 작성한 당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었다. ([단독] 황교안 체제 가늠할 '당 내부 문건' 입수... '후일을 도모한다'란 의미는?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6345&Newsnumb=2019036345)
이 문건 ‘총평’에는 “인사에 있어서는 탕평책을 펼 수 있으나 사무총장만은 친박의 총리님 직계로 임명해야 후일을 도모하는 데 힘이 될 수 있음”이라고 쓰여 있었다. 여기서 ‘총리님’은 황 대표를 말한다. 사무총장은 이 문건대로 친박이 임명됐다. 다른 당직의 경우, 황 대표의 직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주요 요직을 ‘친박’이 접수했다는 사실은 자명해졌다.
황교안 대표가 당내 분란을 봉합하기 위해 '미봉책' 차원에서 (일부러) 모순된 말을 한 건지, 지금으로선 확인할 길이 없다. 분명한 사실은 정치인의 언어는 정치(精緻)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들의 말이 설득력을 갖추려면 그 말에 모순이 없어야 한다. 그 모순이 훗날 부메랑이 돼 한 정치인의 장래를 가로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