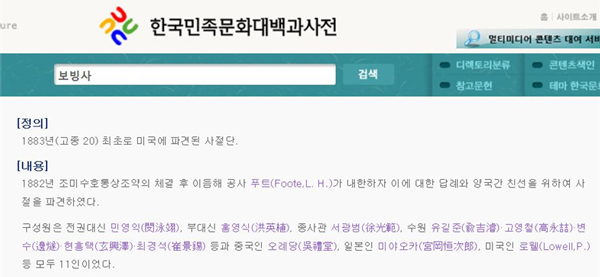조미조약에 대한 몇 가지 문제(4) - 1883년 방미 사절단을 보빙사(報聘使)라 하는 것은 잘못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보빙사’를 검색하면 위와 같이 최초로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이며 구성원은 전권 대신 민영익과 부대신 홍영식을 포함한 11명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보빙사(報聘使)라는 용어는 사절단의 호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민영익(閔泳翊) 개인에게 부여한 호칭도 아니기에 이는 명백히 잘못된 서술이다.
전근대에 사(使)를 붙인 사신이 여럿 있으나 고종 시대의 사신으로는 「조일 수호 조규」 체결 이후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修信使) 김기수(金綺秀)가 익숙하다. 이에 대한 실록의 기록에는 전사(專使:특사)라는 임무와 함께 호칭을 수신사(修信使)로 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수신사는 김기수 개인에게 부여한 직책이며, 그 외 김기수를 따라간 관리는 수대원(隨帶員) 즉 수행원이다. 2차(1880) 수신사는 김홍집(金弘集), 3차(1882) 수신사는 박영효(朴泳孝)이다.
또 다른 사신으로 1881년 청나라에 파견된 영선사(領選使) 김윤식(金允植)이 있다. 김윤식은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견학하기 위한 학도(學徒) 20명과 공장(工匠) 18명 외 수종(隨從)들을 포함하여 모두 69명을 인솔해 간 사신이다. ‘선발된[選] 인원을 인솔[領]하는 사신’이란 의미의 영선사는 김윤식 개인에게 부여한 직책이다. 수신사나 영선사와 마찬가지로 보빙사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직책으로 사절단과 같은 단체의 호칭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현행 교과서의 보빙사와 관련된 서술은 아래와 같다.
|
교학사 |
보빙사, 1883년 미국에 최초로 파견된 사절단이다.(178) |
|
금성출판사 |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은 보빙사로 미국에 다녀왔으며(231) |
|
동아출판 |
미국에 파견된 사절로 민씨 정권의 핵심인 민영익, 홍영식과 서광범이 동행했다.(163) |
|
비상교육 |
한편, 정부는 미국과 수교한 이후 미국의 공사 파견에 대한 답례로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하였다. 보빙사 일행은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각종 근대 시설을 시찰하였다.(207) |
|
지학사 |
1883년 미국으로 파견된 보빙사는 24세의 민영익을 단장으로 하여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었다.(218) |
|
천재교육 |
보빙사 일행(사진), 미국이 공사를 파견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1883년 민영익을 대표로 하여 미국에 파견한 사절단이다. |
위와 같이 ‘사절단’, ‘보빙사 일행’이라 한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단체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수신사와 영선사의 예에서 보듯이 사호(使號)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사절단을 보빙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동아출판의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이 동행했다.’는 서술은 민영익이 대표임을 감안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이다.
 |
| ▲ 미래엔 교과서 180 |
 |
| 뉴욕 헤럴드지에 보도된 고종 신임장 |
미래엔 교과서에는 ‘보빙사 일행’이라는 제목 아래 ‘그래서 수교를 맺은 후 8명의 젊은이들을 미국에 파견하였다. 그들이 바로 1883년 미국에 첫발을 내디딘 보빙사였다.’라 하여 8명 모두를 보빙사로 서술하였다.
또,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들은 미국 대통령을 만나 고종의 신임장을 전달하였다. 이 신임장이 뉴욕 헤럴드 신문에 한글로 번역되어 게재됨으로써, 조선이 고유 문자를 가진 문화국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고 하였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고종이 보낸 신임장은 한글로 되어 있을 터이니 ‘한글로 번역되어’는 ‘영어로 번역되어’로 해야 맞다. 오른쪽 신임장 이미지에도 한글 아래에 ‘translation of the above’라고 되어 있다.
1883년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에 관하여 『고종실록』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미국 공사(公使)가 국서를 가져와 우호 관계가 돈독해졌으니 마땅히 보빙(報聘:답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협판교섭통상사무 민영익은 전권 대신(全權大臣)으로, 협판교섭통상사무 홍영식은 부대신(副大臣)으로 임명하여 떠나게 하라.(美國公使䝴來國書. 隣好旣敦, 宜有報聘. 協辦交涉通商事務閔泳翊爲全權大臣, 協辦交涉通商事務洪英植爲副大臣, 使之前往.)’<『고종실록』 1883. 6. 5.>
이 기록에서 고종은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방으로 민영익을 전권 대신으로, 홍영식을 부대신으로 임명하였을 뿐 민영익에게 별도의 보빙사라는 직함을 부여하지 않았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보빙사(報聘使)로 부르는 것은 잘못이며, 나아가 일행 모두를 보빙사라 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이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잘못 써온 보빙사는 ‘미국 방문 사절단’ 또는 ‘방미 사절단’이라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필자는 논란이 많았던 국정 한국사 교과서 검토본에 대한 이의 제기 과정에서 ‘보빙사’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에 최종본 국정 교과서에서는 이를 모두 아래와 같이 ‘미국 방문 사절단’으로 수정하였다.
 |
| ▲ 국정 교과서 방미 사절단 서술 수정 전(좌)와 수정 후(우) |
그런데 리베르스쿨 교과서는 ‘조선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이후 미국 공사의 파견에 대한 답례로 1883년에 전권 대사 민영익 등을 보빙사로 미국에 파견하였다.(리베르스쿨 210)’고 하여 민영익을 ‘전권 대신’이 아닌 ‘전권 대사’로 소개하였다. 대신(大臣)과 대사(大使)는 엄연히 다름에도 이를 구분하지 못한 것은 실수를 넘어서 교과서 집필자의 자격이 의심스러워진다.
이와 동일한 오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도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출제한 시험에서 이런 오류가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고급) 27회 30번 |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에는 ‘보빙사(報聘使)를 아십니까?’라는 카드뉴스를 실었는데, 여기서도 보빙사에 대한 설명은 교과서와 차이가 없다. 이 블로그에는 보빙사 용어의 오용 외에 더 황당한 사진 설명이 있다.
 |
| ▲ 대한민국 정부 대표 블로그 수록 자료(출처:http://blog.naver.com/hellopolicy/220509745145) |
조선의 대표와 부대표를 모두 전권대사로 쓰고 슈펠트는 전권공사라고 하였다. 모두 잘못이다. 「조미조약」 마지막에는 ‘전권 대관(全權大官) 신헌(申櫶), 전권 부관(全權副官) 김홍집(金弘集), 전권 대신(全權大臣) 수사 총병(水師總兵) 슈펠트〔薛裴爾:Shufeldt, R.W.〕’라고 되어 있다. 전권 대사라고 한 것도 모자라 정(正)과 부(副)의 구분도 하지 않고 모두 전권 대사라고 하였으니 실수라 하기에는 지나치다.
우리 역사 용어는 거의 모두가 한자어다. 한자어를 교과서에 쓰면서 한자는 버리고 한글로만 적으니 개념이 불분명하고 위와 같은 오용(誤用) 사례가 자꾸 발생하게 된다. 한자・한문을 모르고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영어를 모르고 미국사를 연구하는 것과 같다. 한자・한문을 외면하면 할수록 우리 역사는 점점 흐릿해질 수밖에 없다. 한자・한문을 제대로 모르고 중국과의 역사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지금부터라도 초・중・고에서는 최소한의 한자를 가르쳐 전문 연구를 위한 기초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