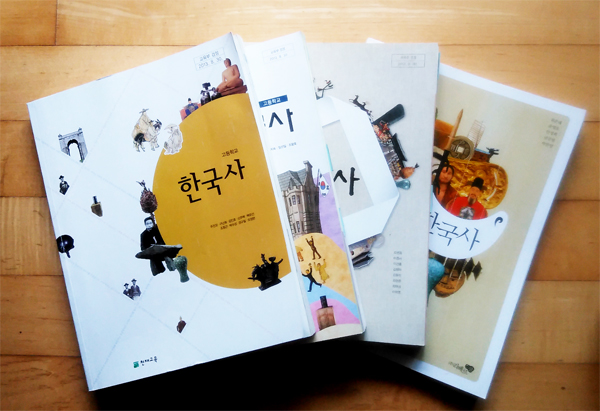1. 천재교육과 비상교육 교과서의 이상한 중간 생략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195쪽에는 ‘1882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면서 한성에서의 점포 개설과 내륙에서의 통상이 허용되자, 청 상인들은 자금력과 뛰어난 상술로 급속히 상권을 확대해 나갔다.’고 하여 조선은 「조・청 무역 장정」에서 청에게 내륙 통상을 허용한 것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같은 쪽 하단에는 「조・청 무역 장정」 제4조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였다.
 |
이를 옮기면 아래와 같다.
‘제4조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 …… 양국 상인이 내지로 들어가 토산물을 구입하려고 할 때에는 상무위원 및 지방관이 함께 허가증을 발급하되 구입할 처소를 명시하고, 수레와 배 등을 해당 상인이 고용하도록 하고, 세금은 규정대로 완납해야 한다.’<천재교육, 195>
조문 중간에는 ‘……’로 일부 생략되었음을 표시하였는데, 이 부분에는 ‘각종 화물을 내지로 運入하여 상점을 차리고 售賣(수매:판매)하는 것은 승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생략되었다. 앞부분에서 승인된 開棧(개잔) 무역을 제외하고 내륙으로 물건을 가져가서 판매하는 내륙 무역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 조문의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왜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생략했을까? 이 문장이 있으면 본문에서 서술한 ‘내륙에서의 통상 허용’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은 아닐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하단에서는 ‘자료1의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라 하여 학생들이 토론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문 서술에서는 ‘내륙 통상 허용’이라고 하였으나 제시된 자료에는 이와 상반된 ‘내륙 통상 금지’라는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 이런 자료를 보고 학생들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집필자는 본인들이 집필한 이 자료를 보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모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출판사에서는 ‘내지 통상 허용’이라는 본문 서술이 「조・청 무역 장정」의 어느 조항,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알려달라는 필자의 요구에 제4조의 ‘내지로 들어가 토산물을 구입하려고 할 때에는 증명서를 발급 받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다.’는 조문이라고 하였다. ‘내지에서의 토산물 구매’를 ‘내지 통상 허용’이라고 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은 맥락의 답변이다. 하지만, 출판사에서 저자 최종안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 답변은 「조・청 무역 장정」 제4조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조・청 무역 장정」 제4조에는 통상에 해당하는 단어인 무역과 交易(교역)이 있으며, 판매에 해당하는 售賣(수매), 구매에 해당하는 採辦(채판)이 있다. 개방한 항구에서는 소유한 토산물과 금지하지 않은 상품은 모두 교역할 수 있다. 통상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양화진과 한성에서 개설이 허락된 行棧(행잔)에서의 교역은 허락하지만, 내지로 상품을 운입하여 가게를 열어 판매할 수는 없다. 만약 내지로 들어가 토산물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증명서를 발급 받는 등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통상이라는 단어에 대해 사전에서는 ‘나라들 사이에 서로 물품을 사고팖. 또는 그런 관계.’라고 되어 있다. 내지에서의 판매는 금지하고 조건부 구매만 허용한 제4조는 당연히 내지 통상 허용이라 할 수 없다.
비상교육 교과서의 경우 2014년 판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다.
‘제4조 ……청의 상인은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 상점을 열거나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여러 물건을 내륙 지방에 운반하여 점포를 차려 놓는 것을 금지하고, 다만 이것이 필요한 경우 지방관의 허가증(호조, 護照)을 받아야 한다.’(비상교육, 242쪽)
이 부분의 번역이 잘못이라는 필자의 지적 때문인지 2016년 판에는 천재교육 교과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그런데, 비상교육은 ‘내지 통상 허용’이 잘못된 서술이라는 필자의 이의 제기에 ‘교과서의 표현은 조약 문구상으로는 틀리지만 실제 현지에서는 그렇게 시행되었으므로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던 것’이라고 했다. 조약을 다룬 교과서 표현이 조약 문구와 다르면 그것은 서술 오류다. 명백한 서술 오류임에도 수정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러한 오류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 없이 당연하다는 듯 답변하는 집필자의 태도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2. 미래엔 교과서의 어이없는 사료 번역
미래엔 교과서에는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규정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강제로 체결해 청 상인이 내륙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경제적 특권을 보장받았다.’는 본문 서술과 함께 「조・청 무역 장정」 제4조를 자료로 제시하였다.
 |
‘제4조: 베이징과 한성, 양화진에서 상점을 열어 무역을 허락하되, 양국 상민의 내지 행상을 금한다. 다만 내지 행상이 필요할 경우 지방관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미래엔, 187)
제시된 자료를 보면 어법도 맞지 않고 내용도 제멋대로다. ‘상점을 열어 무역을 허락하되’는 무역을 허락하기 위해 상점을 연다는 뜻인가? 이어지는 ‘내지 행상을 금한다. 다만 내지 행상이 필요할 경우’에서 ‘내지 행상을 금한다.’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지 행상이 필요할 경우’라는 내용은 제4조에 없다. 이를 보면 집필자는 제4조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 글을 썼음이 분명하다. ‘양화진과 한성에서의 開棧(개잔) 무역을 제외하고 내지로 각종 상품을 운입하여 가게를 열어 판매할 수 없다. 만약 내지로 들어가서 토산물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절차를 거처야 한다.’는 내용을 안다면 이렇게 황당한 번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교과서에는 뜬금없이 다른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강제 체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어떤 이유에서 강제 체결이라 했는지 궁금하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도 그랬듯이 모든 한국사 교과서의 ‘내지 통상 허용’에 관한 서술은 ‘내지에서의 토산물 구매’ 조문을 ‘내지에서의 통상 허용’으로 잘못 해석하여 초래된 잘못된 학설이다. 이러한 잘못된 학설의 근원은 국사편찬위원회 『신편한국사』의 서술에 있다.
‘제4조:북경과 漢城·楊花津에서의 開棧貿易을 허용하되 양국상민의 內地采辦 금지. 단 내지채판 및 遊歷이 필요할 경우 지방관의 執照를 받을 것.’(采는 採의 잘못-필자 주)
‘제4조의 서울을 개시장으로 한다는 내용과 호조가 있으면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행상이 가능하다는 내지통상권에 대한 규정’<『신편한국사』 38, 국사편찬위원회>
「조・청 무역 장정」 제4조에는 ‘양국상민의 內地采辦 금지’, ‘서울을 개시장으로 한다’, ‘호조가 있으면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행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다. 아마도 이 부분 집필자는 1차 사료인 원전을 전혀 읽지 않았거나 읽었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문을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이렇게 쓸 수 없다. 이러한 『신편한국사』의 터무니없는 오류가 하나의 학설이 되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수록되고 한국사 교과서에 수록되어 수많은 학생들이 배웠고 또 배우고 있다.
『신편한국사』에는 「조・청 무역 장정」 제4조를 들어 ‘내지 통상 허용’이라 했는가 하면 제7조를 들어서는 ‘연안 무역권의 승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서술도 오류다. 이 부분은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천재교육 집필자가 내지 통상권 허용에 대한 필자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덧붙여 언급한 부분이기에 살펴보기로 한다. 제7조는 아래와 같다.
‘제7조: 양국의 驛路(역로)는 이전에 책문을 경유하여 육로 왕래에는 경유할 때의 공급에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든다. 현재 海禁(해금)이 열렸으니 각자 편의에 따라 바닷길로 왕래하는 것을 승인한다.’
(第七條: 兩國驛道, 向由柵門, 陸路往來, 所由供億, 極爲煩費. 現在海禁已開, 自應就便, 聽由海道來往.)
이는 ‘양국의 역마 길은 지금까지 柵門(책문:청나라의 지명)의 육로를 경유하여 왕래했기 때문에 경유할 때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었다. 현재는 바닷길의 통행금지가 풀렸으니 각자 편한 방법을 택하여 해로로 왕래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천재교육 집필자는 이 조문의 ‘就便(취편)’이라는 단어가 바로 ‘연안 무역의 핵심’이라 하며, 편리한 대로 조선 내 항구를 어디든지 왕래하며 무역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就便(취편)은 ‘책문의 육로나 통행금지가 풀린 해로 중에 편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뜻이지 조선 연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조・청 무역 장정」 제3조의 ‘……아울러 해안에 올라가 음식물과 식수를 살 수 있으나, 사적으로 화물을 무역할 수 없다.……’는 조문을 보더라도 연안 무역을 허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연안 무역권 승인’이라는 서술도 명백한 오류다.
이 외에도 잘못된 서술은 적지 않다. 리베르스쿨 교과서는 묄렌도르프가 「조・청 무역 장정」을 체결한 것으로 서술하였다. 조선 대표는 陳奏正使(진주정사) 趙寧夏(조영하)이며, 청의 대표는 津海關道(진해관도) 周馥(주복)이다. 동아출판 교과서에는 1882년 8월이 1882년 10월로 잘못 기술되어 있다. 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주정사(奏正使) 조영하와 청나라의 直隷總督(직례총독) 李鴻章(이홍장)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하였으나 주정사(奏正使)는 ‘진주정사(陳奏正使)의 잘못이며, 이홍장은 무역 장정 체결을 주도한 인물이긴 하나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다. 청의 대표는 진해관도 주복이다.
 |
현행 8종 검정 한국사 교과서에 「조・청 무역 장정」 제4조를 들어 ‘내지 통상권 허용.’이라 한 서술은 모두 오류다. 교과서에는 조약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약문을 발췌하여 자료로 제시하였으나, 조약문을 지나치게 축약하거나 본래의 의미를 알 수 없는 부실한 번역 등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그 중 정도가 심한 세 교과서를 선택하여 그 오류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이 외에도 「조・청 무역 장정」과 관련한 교과서의 잘못된 서술을 지적하자면 끝이 없다.
개항기 외국과 체결된 조선 정부의 조약문은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다. 한문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들 조약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필자가 지적한 오류도 모두 한문 이해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 물론 앞으로 쓸 근현대사의 나머지와 전근대사의 서술 오류도 마찬가지다. 한문 홀대가 초래한 역사 서술의 오류는 생각보다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