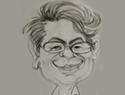- 6월 11일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후보. 사진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마선언을 하는 모습. 사진=조선 DB
연예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다. 정치판에서도 나이는 경쟁력과 직결될 정도로 예민한 것이었다. 정치인들은 나이때문에 궁지로 몰리기도 했고, 주목받기도 했다. 나이에는 이들의 애환이 서려있었다.
# YS(김영삼)에게 따라붙는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에는 사연이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당시엔 민의원) 첫 출마 당시 연령제한에 걸리자 호적상 나이를 올렸다는 것.
장택상 총리의 비서관을 지냈던 그는 1954년 민의원 선거 때 자유당 공천으로 고향인 거제에 출마, 첫 당선됐고 당시 후보홍보물에 기록된 나이는 26세였다. 선거출마 제한연령(25세)을 가까스로 넘겨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고 그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실제 나이는 이보다 두 살 적었다고 한다. 호적상 24세에 불과, 출마 자체가 불가능했다. 부친도 당초엔 출마를 만류했으나 출마의지가 강했던 아들 YS를 위해 면사무소를 찾아가 호적상 출생연도를 2년 늦췄던 것. 나이를 변경한 덕에 최연소 당선자 타이틀을 차지하며 이름을 날렸던 셈이다.
호적 나이를 고치지않았다면 YS는 당시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고, 부산으로 지역구를 옮겨 재선 의원으로 당선됐던 1960년 민의원 선거때가 첫 출마 였을 수 있다. 이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첫 출마 나이는 30세였다. 당시 선거때 전북 진안에 출마, 첫 당선됐던 전휴상 후보가 26세였다는 점에서 최연소 의원 기록은 그에게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YS는 정정된 나이(1927년 12월 20일)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 후보보다 2개월 늦게 출생, 1954년 선거 당시의 ‘최연소 기록’을 계속 보유할 수 있었다.
1997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DJ(김대중)는 YS와 정반대 처지에 놓였다.
경쟁자였던 이회창 후보와 소속당인 한나라당 측은 DJ가 호적상 나이인 72세보다 실제론 더 많다는 등 고령임을 집중 부각시키며 건강문제를 선거전 막판까지 이슈화했다.
야당 공세로 쫒기던 DJ는 ‘뉴 DJ 플랜’으로 맞섰다. 뉴 DJ 플랜이란 대선에서 세차례나 낙선했던 그가 마지막 출마가 될 수 있었던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제고를 위해 자신의 이미지를 탈바꿈해나가는 전략이었다. 이에 따라 DJ는 양복 앞주머니에 행커칩을 하는 등 노인이란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애썼다.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 나이문제가 거론되자 "실제 출생일은 음력으로 1923년12월23일, 양력으론 1924년1월6일이나 일제 징병을 당하지 않기 위해 선친이 호적정정 신청을 내서 1925년 12월3일로 고쳤다"고 했다. 호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적지만 한 살 밖에 낮추지 않았다고 했다. 항간에선 호적 나이보다 세 살 많다는 얘기가 들렸을 때다.
# YS 정부 시절인 1995년, 김윤환 정무 1 장관은 정치인들의 정년문제를 언급했다가 파문을 일으켰다.
김 장관은 "JP(김종필: 당시 민자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오해받을까봐 언급을 자제했으나 정치인들도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70세가 넘으면 은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는 일본 정당 사례를 제시, 65세나 70세가 되면 공천에서 베제됐음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특히 집권당인 민자당의 계파 갈등과 맞물려 공화계(JP 세력)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당시 JP는 호적상 69세였다. 게다가 1992년 대선 패배후 정계은퇴를 선언했던 DJ가 정계복귀를 모색하던 상황과도 맞물려 파문이 더욱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호적상 DJ는 JP보다 한 살 많았다.
결국 김 장관은 발언 나흘 뒤 "지역구공천 정년제를 얘기한 것이 잘못 전달됐다"며 "70세가 넘으면 정계은퇴해야 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정치과제중 하나인 세대교체를 위해선 일본의 신생당처럼 70세 이상에 대해선 지역구 공천을 주지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의 주장은 그러나 정치권에서 대세로 굳어져 갔다. 여야 각 당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개혁 의지를 부각시켰고 연령문제에 초점을 맞춰 물갈이를 단행해 왔던 것이다. 65세이상 의원들이 타깃이었다. 대상 의원들 측에서 거센 반발이 잇따랐고 일부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연령을 구분해야 한다는 등 자신의 나이를 낮추려고 애쓰기도 했다.
이 연령대 의원들이 모두 공천장을 받지못했던 것은 아니었다. '노·장·청 조화' 등의 명분으로, 아니면 당내 주류에 속했기에 살아남았던 쪽도 있었다. 정치적 생존경쟁이 어느 연령대보다 뜨거웠다.
#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의원경력조차 없는 30대의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당 쇄신여론과 맞아떨어진 상황때문이다.
이참에 대선 출마 연령제한을 낮추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선후보 나이를 4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 헌법에 처음으로 규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왔다는 점에서 시대 변화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연령제한을 바꾸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엔 대선 정국까지 맞물려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적지않다. 레임덕(권력 누수)에 빠질 임기말 정부에서 개헌이 추진된다면 각종 실정(失政)을 덮을 수 있다.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 또한 기명식인 만큼 ‘개헌 대 반개헌’ 식으로 편가르기를 함으로써 대선 판세를 흔들 수도 있다.
대선 출마연령을 낮추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지만 올해는 아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는 꼴이다.